화보로 보는 한국의 1인당 GDP 변천사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다
⊙ ‘하면 된다’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경제성장의 자원이었다
⊙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6시간 노동과 잔업, 야근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눈물 겨운 공순이·공돌이 神話를 만들었다
가난은 자부심이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이겨낸 자부심은 가난이었다. 6·25는 인류역사상 6번째로 참혹한 전쟁이었다. 옷을 뒤집어 털면 깨소금 같은 이가 쏟아지던 시절, 배고파 몸부림치던 절망을 이겨낸 힘이 바로 가난이었다. 가난 앞에선 누구도 책임과 무책임을 따져 묻지 않았다.
가난은 동포끼리 가해진 폭력과 패악과 모욕을 이겨내게 했다. 퇴행과 파탄의 역사 속에 신음했을망정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난 때문이었다. 먹고살기 위해서였다. 그 힘이 ‘기적’을 만들었다.
원조물자가 들어오자 마다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살려달라 발버둥쳤다.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앞서 복구의 삽날을 먼저 들었다. ‘하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부르짖었다.
그 희망이 끊어진 한강다리를 이었고 비료·설탕공장을 새로 지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빨리 고속도로를 놓았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6시간 노동과 잔업, 야근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눈물 겨운 공순이·공돌이 神話(신화)를 만들었다. 어디 그뿐이랴. 사막의 해충과 싸우며 독일의 캄캄한 막장에서 검은 진폐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그 발판 위에 4만 달러의 꿈을 꾼다.


폐허 위에서 ‘숟가락 몽댕이’ 하나로 다시 일어설 즈음,
한국의 공식적인 1인당 GDP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GDP 통계는 1970년부터 집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1953년의 1인당 GNP는 67달러로 기록돼 있다. 세계에서 몇 번째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살기 위해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외국의 원조물자로 연명하던 시절이었다. 1950년대 당시 수출품은 마른오징어, 한천, 김 등 식료품이 대부분이었고 중석과 흑연, 철광석 등 광산물이 중심이었다.
1955년 충주비료공장 起工(기공)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내자본 2억7500만원에다 차관 3333만8000달러가 투입된 국내 최초의 현대식 화학비료 공장이었다. 이것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핵심인 석유화학공업 건설의 추진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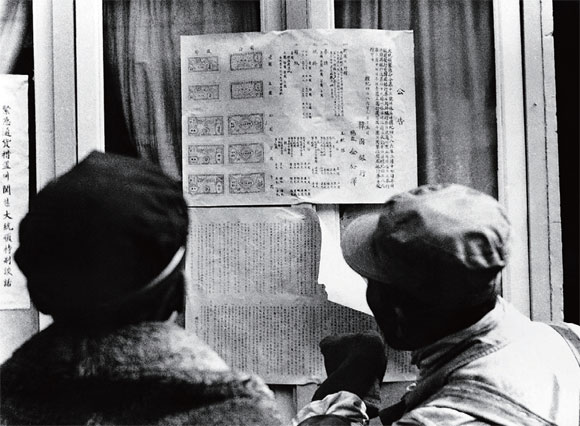

전쟁고아를 위한 구호품 전달 / 195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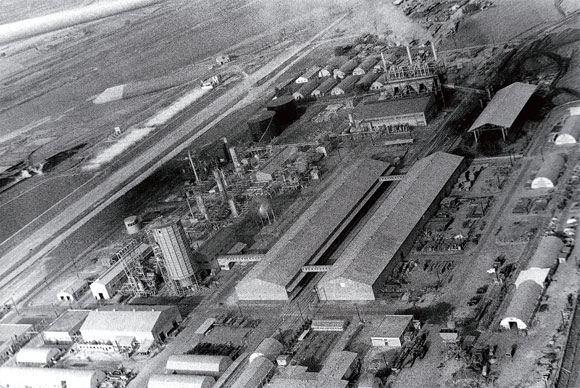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은 1962년 1월 13일. 故(고)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쓴 <국가와 혁명과 나>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등 객차에서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경제 후진성 극복과 국민경제의 자립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경제성장 구호가 ‘고운 손으로 살 수 없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자’였다. ‘한강의 기적’은 그런 피와 땀에서 나왔다.
그해 2월 수출입국과 공업입국의 깃발 아래 울산공업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삽이었다. 1968년까지 석유화학업종 관련 공장 13개가 들어섰다. 울산은 초기 박정희의 개발신화가 서려 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碩學(석학) 새뮤얼 헌팅턴이 2001년 9월 펴낸 <문화가 중요하다(Culture matters)>의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1990년대 초, 나는 1960년대 당시 한국과 가나의 경제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깜짝 놀랐다.’
양국의 1인당 GNP 수준이 비슷했다. 1차 제품(농산품), 2차 제품(공산품), 서비스의 경제 점유 분포도 비슷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만들어 내는 2차 제품이 별로 없었고 상당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다.
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산업강국으로 발전했다. 현재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이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화’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인들의 검약, 투자, 근면, 교육, 조직, 기강, 克己(극기)정신 등이 하나의 가치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金秀坤(김수곤) 前(전) KDI 부원장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배고픈 동물이 이긴다”고 말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호랑이들은 너무나 굶주려 먹고사는 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감내할 자세가 돼 있었다.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젊은이들은 노동 악조건과 밤샘 노동에 구애받지 않고 죽도록 일했다.
죽어 돌아온 派獨 광부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것도 이즈음인 1960년대 초였다. 1963년 派獨(파독) 광부 500명 모집에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상당수가 대학졸업자와 중퇴자들. 당시 남한 인구 2400만명, 정부공식 실업자 숫자만 250만명이 넘었다. 이들은 독일 탄광의 지하 1000m와 3000m 사이 막장에서 기꺼이 석탄가루를 마셨다.

1966년 12월, 3년의 고용기간을 채우고 142명의 파독 광부 1진이 귀국했다. 거의 전원이 골절상 병력을 안고 돌아왔다. 개중에는 사망자도 있었고, 失明(실명)한 이도 있었다. 간호사 언니·누나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1966~76년 독일로 건너간 한국 간호사가 1만30명, 광부들은 1963~78년까지 7800여 명이 건너갔다. 이들의 송금액은 연간 5000만 달러로, 한때 GNP의 2%대에 달했다. 그들의 희생이 한국경제의 저력이 됐다. 1970년이 밝았다. 당시 1인당 GDP는 254달러. 경제성장률은 8.8%였지만 경상수지는 -6억225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세계 최단시간 내 완성한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것도 1970년 7월이었다. 착공한 것이 1968년 2월 1일. 2년5개월 뒤 428km를 뚫은 것이다. 故(고) 鄭周永(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총칼이 없을 뿐 전쟁이었다. 나는 흑자를 포기, 명예를 선택했다”고 증언했다.

이듬해 1971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다. 새마을 운동은 ‘하면 된다’와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정신적 資産(자산)이 됐다.

1973년 7월 3일 경북 포항에서 준공된 ‘포철 제1기’ 설비는 민족의 에너지에 불을 붙인 일대 사건이었다. 1970년 4월 첫 삽을 뜬 지 3년 만의 결실이었다. 朴泰俊(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성공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각오로 一貫(일관) 제철소 건설의 첫 삽을 떴다”고 회고했다.
사막의 독거미와 해충과 싸우다
1974년은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한 첫해로 기억된다. 사막 한가운데 캠프를 치고 모래 바람과 독거미, 전갈, 해충과 싸워가며 오일 달러를 벌어 들였다. 살기 위한 몸부림은 사막의 열기마저 뛰어넘었다. 삼환기업 崔鍾煥(최종환) 명예회장은 “중동 건설시장 개척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70~80년대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1977년은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 1034달러를 기록한 해다. 동시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이기도 하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넘은 뒤 13년 만이었다. 당시 상공부장관이던 崔珏圭(최각규) 장관은 “1980년을 목표로 전력투구했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3년 앞당긴 쾌거였다”며 “개도국 경제개발 전략의 모델이 됐다”고 회상했다.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은 것은 6년 뒤인 1983년. 그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D램이 개발됐다. 반도체 산업이 날개를 달게 되면서 이후 전자산업과 IT산업이 한국경제를 이끌게 된다. 모래성분에 불과한 실리콘 덩어리가 한국인의 손으로,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담아내는 도구가 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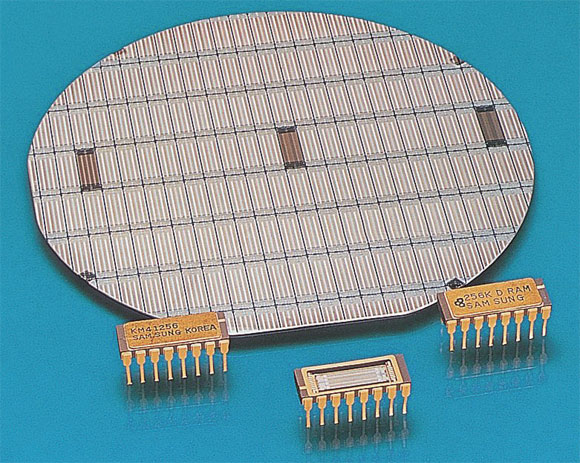
1986년은 무역흑자의 元年(원년)으로 기록된다. 5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마무리 짓던 해였다. 1인당 GDP는 2643달러. 한국의 수출이 수입을 처음으로 넘어 49억94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金滿堤(김만제) 당시 경제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와 물가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최초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흑자의 축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 적자로 돌아선다. 그러나 1인당 GDP는 6147달러를 기록, 6000달러 고지를 넘어선다. 수출품목도 1980년 의류·철강판·신발에서, 1985년은 선박·의류·신발, 1990년 들어서는 반도체·신발·영상기기로 바뀌게 됐다. 반도체가 최대 수출품목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다.
黃昌圭(황창규) 前(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은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반도체 박스에는 삼성 로고가 없었다”며 “같은 무게의 금보다 5배 이상 비싸, 유통과정에서 도둑들의 표적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1995년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
1인당 GDP 1만 달러 달성은 1995년에야 가능했다. 1만1472달러. 홍콩은 1987년, 싱가포르는 1989년, 타이완(台灣)이 1992년에 1만 달러 고지를 넘은 것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4龍(용)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일본은 4만1823달러로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당시 세계은행(IBRD)은 ‘아시아 경제 기적’의 모델로 한국과 타이완을 선정했다. 덧붙여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를 실현한 나라’로 평가했다. 1996년 1만2197달러를 거쳐 세계 29번째로 OECD에 가입, 축포를 쏘았다. 하지만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예견하진 못했다.

이듬해 1997년 IMF가 터졌다. IMF 구제금융. 소설가 韓水山(한수산)은 “성장만이 우리의 것으로 알았던 황금시대의 끝은 너무나 황망했다”고 썼다. 大宇(대우)와 金宇中(김우중) 신화가 몰락했고 150만의 실업대란으로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1998년 1인당 GDP가 7355달러로 곤두박질쳤다. 視界(시계)는 흐렸고 전망은 불투명했다. 사람들은 장롱 속 ‘금 반지’를 내놓았고 금융·기업·노사·공공 4大(대) 부문 개혁에 스스로를 내맡겼다.

침몰하던 한국경제는 1998년 바닥을 치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1999년 9438달러를 거쳐 2000년 1만1349달러로 다시 1만 달러 고지를 奪還(탈환)한 것이다. 2000년은 IMF라는 혼란과 혼동의 파고를 넘긴 새천년이었다.
2000년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선 시기다. 자동차·조선·휴대폰·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자본 제품, 가격보다는 품질, 디자인 및 브랜드 중심의 제품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수출품목 중 반도체·컴퓨터·자동차가 1~3위를 차지했다.

2001년 1만655달러로 주춤하다가 韓日(한일)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1만2093달러, 2005년에는 1만7547달러, 2006년 1만9693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연간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한 해였다. 100억 달러 수출(1977년) 이후 29년, 1000억 달러 수출(95년) 이후 11년, 2000억 달러 수출(2004년)을 기록한 지 2년 만의 성과였다.

2만 달러 고지에서 4만 달러를 꿈꾸다
2007년 드디어 2만1655달러로 ‘2만의 고지’를 점령했다. 이듬해 2008년 1인당 GDP 순위는 다소 주춤(1만9106달러)했지만 그해 수출 4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대로라면 2011년(이르면 2010년) 5000억 달러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수출 5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독일·중국·일본 4개국에 불과하다. 李熙範(이희범) 前(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일본이 수출 30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로 가는 데 13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0년 1월 ‘2만 달러 고지’에서 4만 달러의 神話(신화)를 꿈꾼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두 곱 이상 달려야 가능한 일이지만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몫이라 했던가. 지난 60년의 한국경제 역사가 시련을 극복하는 신화가 아니던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낸 가난의 자부심이 아니던가. 하여 다시 ‘4만의 꿈’을 꾼다. 꿈을 이룰 大戰略(대전략)을 세우며.
4만 달러시대는 先進國이고 善進國이어야
생명의 안전, 사회복지, 공동체의 신뢰도, 안보능력, 국력과 國格,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두 배가 되는 노력을 해야
⊙ 대한민국이 제3세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돈보다는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교본,
텍스트, 매뉴얼이다
金鎭炫
⊙ 1936년 경기 안성 출생.
⊙ 양정고,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과정(경제개발) 수료.
고려대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대 명예공학 박사.
⊙ 동아일보 기자·편집부국장, 문화일보 대표, 과학기술처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장,
서울시립대 총장 역임. 現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즉 4만 달러 시대라는 뜻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1인당 소득 4만 달러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 노동, 지식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종래의 경제 패러다임의 선진화는 물론 시민의 삶, 사회 공동체와 국가관리 전체가 신뢰, 자발, 협동, 합의, 大同(대동)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善進’(선진)화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함의를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先進(선진)국이되 ‘善進(선진)’국인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가 됐을 무렵엔 GNP(국민총생산), GDP(국내총생산), GNI(국민총소득)의 개념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이 4%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 조건 속에서, 그리고 ‘7% 성장’의 꿈이 아주 멀리 사라진 지금(엄격히 말하면 우리만의 조건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4만 달러 달성의 고지에 이르기에는 최소 1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현재의 GNP, GDP, GNI 계산 방식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을지는 회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 GNP 계산방식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봉사와 非(비)시장에서의 노동과 상품거래, 부패와 그 비용 등을 반영한 새 계산 방식을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녹색 GNP’가 통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GNP 방식대로라면 환경파괴에 따른 신규투자가 성장요인이 되는데, 녹색 GNP로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중국이 일찍이 시도했다 포기했지만,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연합(UN) 기후변화정상회의(COP15)가 성공한다면 녹색 GNP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4만 달러 소득시대라든가 선진·중진·후진국의 선별기준은 어떤 계산방식, 어떤 생활방식, 어떤 가치체계를 따를 것이냐는 명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의미
이 점에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의 소득과 지출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배가 된다는 뜻이다. 또 한국이 앞으로 15년 동안 소득 4만 달러 수준인 오늘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걸은 길을 복습해 가면 된다는 뜻이지만 이들 국가의 오늘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15년 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이들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세대갈등, 격차와 소외, 이민족(이주노동자와 소수종교) 수용문제가 만만치 않거니와 미국, 러시아까지를 포함해 현재 선진국의 ‘근대성’, ‘선진성’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근본의문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의 終焉(종언)은 한 세기의 끝장이 아니다. 르네상스 이래 500년의 서양의 근대가 끝난 것이라는 입장, 超(초)근대 脫(탈)근대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서양적 근대, 서양적 선진성이라는 것이 추구할 목표인가 하는 회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창한 문명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영국의 브라운 총리가 선언했듯이 월스트리트 자본주의 논리인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의 종말’이 왔고, 미국의 전설적 경영영웅이었던 GE의 잭 웰치가 스스로 ‘주주가치 경영의 과오’를 선언한 상태다.
또 영국중앙은행은 창립 이래 415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금리를, 미국중앙은행(FRB) 역시 창립 이래 95년 만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를 쓰는 금융기본질서의 파괴상황이다. 워싱턴 컨센서스, 주주가치 경영방식과 선진금융 방식에 의한 ‘선진 경제’ ‘경제 선진화’가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하는 명제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역량으로는 너무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 위기 후 그 진원지인 미국과 영국, 특히 프랑스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체제문제, 관리실패, 위기예측 실패 등)에서 반성과 책임 추궁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체제, 관리 책임자 측에서는 단 한 명의 경제학자도 금융인도 정치인도 반성의 글과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선진성’, 선진 경제가 무엇이며 지속가능한 선진성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가 제기조차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기껏 미국과 현 정부에 대한 이념적 반대와 비판에 치우쳐 대한민국 5000만의 선진화란 무엇인가의 목적의식이 쑥 빠져버리고, 북한의 선군정치 유일사상을 용인하는 한국식 좌파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다.
GDP 소득이 배가 된다는 뜻

GDP 소득이 지금보다 배가 된다는 뜻보다 한국에서 사는 생명들의 삶의 가치가 두 배가 되고 생명의 안전이 두 배가 되며 사회복지가 두 배, 공동체의 신뢰도가 두 배, 안보능력(평화를 지키는 능력)이 두 배, 국력이 두 배, 國格(국격)이 두 배,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두 배가 되는 노력을 하다 보면 GDP 계산방식의 소득도 4만 달러가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면서 정치, 문화, 도덕수준에서 ‘善進’(선진)국민인 것이다.
첫째의 길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자원’ 조건에 충실한 선진화다. 선진국 중에서 필자가 생명자원이라 정의한 에너지와 식량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세계 최대 석유수입국인 미국만 해도 1960년대까지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이었다. 지금도 소비패턴만 바꾸면 自國(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석탄, 가스와 非(비)화석 연료만으로도 비상시 에너지 자급이 가능하다. 유럽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생명자원을 더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의 거의 100%, 쌀을 제외한 콩, 밀, 옥수수의 약 90%를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선진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거니와 미래에는 더욱 없을 것이다.
한편에선 R&D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와 먹을거리의 자급을 기도하고 또 한편에선 절약과 효율의 사회시스템, 소비양식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세계에서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교통절약, 노동절약, 공간절약, 식량절약, 교통절약, 환경절약에서 최고의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 생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가 생명자원의 자립지향에 성공하면 그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혁신의 산물은 21세기 제3세계 후진국들의 생명자원 부족을 해결하는 선구자(수출자)로 변신해 대한민국의 國富(국부)를 창출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善進’(선진)국이 된다.
스위스의 실체를 배우자
둘째의 길은 스위스의 길이다. 스위스는 세계평화의 상징국이며 경제와 기술의 최일등국이다. 동시에 상비병 없이 민병대에만 의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핵폭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무장 중립국’이다. 철저한 지방자치로 사실상 중앙정부가 없다 싶을 정도이면서도 4개 언어, 4개 종족과 22개 캔톤(일종의 州)이라는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신뢰가 성숙돼 있다.
상업국가 싱가포르, 네덜란드, 두바이에서 배우려 하지 말자. 생명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주변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외국군의 군화에 여러 번 짓밟힌 경험과, 장성한 아들들을 모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傭兵(용병)으로 보내 먹고살던 찢어진 가난을 극복해 평화·안전·성장·복지·존경·신뢰의 모범 선진국이 된 스위스의 실체를 배워야 한다.
셋째, 21세기 세계적 선진 모범국(Global Korea Model)이 되는 ‘창조적’ 노력을 기울이자.
새 문명, 새 패러다임, 새 질서의 탄생은 舊(구)문명, 구질서의 주역에서가 아니라 새 주체, 새 행동자(actor), 他者(타자)에 의해 나온다. 그 새 주역은 결코 구문명, 구질서의 경험과 담을 쌓은 타자가 아니라 구문명 구질서의 주체가 아닌 타자이되 구문명 구질서를 충분히 흡수, 소화한 ‘융통하는 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非(비)서양 제3세계 국가 중 근대화를 완성한 유일한 나라다. 민주화, 산업화, 시민자유,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 사회의 다원성, 스포츠 등 근대화 기준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인도, 중국,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 등 제3세계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앞서갔다. 심지어 과학기술, 교육, 종교부문에서는 서양 선진국보다 앞서 버렸다.
이제 파라과이 루고 신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공을 배우기 위해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만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인도대륙, 동남아로부터는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자발적 노력들이 등장한 지도 오래됐다. 국가나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그 경험과 교훈의 전수를 위해 이들 후진국들과 협력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3세계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돈이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이다. 근대화 혁명이 교본, 텍스트, 매뉴얼이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근대화혁명’의 내용을 완숙하게 숙성시켜놓았다.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버마,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제3세계의 개별수요에 적합하도록 우리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원리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정리·발효해 이들 개별국가의 실체적 발전요구에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텍스트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우리 자신의 역량에 달렸다.

글로벌 한국 모델로 가는 길
우리의 자랑만을, 또는 우리의 과거 실적을 나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인 ‘근대화 혁명’을 객관화하는 보편적 구체적 노력이야말로 한국이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런 객관화를 통해 대한민국 성취를 他者化(타자화)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사적 도전, 즉 전통과 근대의 뛰어넘기, 동양과 서양의 가교, 대륙과 해양 사이의 단층 아닌 완충, 선진국과 제3세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라는 글로벌 한국 모델(Global Korea Model)을 창조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특수조건을 세계 보편적 조건으로 역전시키는 것이다.
① 20세기 냉전과 분단과 전쟁의 최대 비극의 현장인 휴전선(DMZ)을 ‘세계평화지대’ 지구촌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관리의 휴전, 평화지대를 넘어 유엔 관리하의 세계평화지대로 유엔 관련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구상(1996년과 2008년 제안)이 그것이다.
② 남북교류기금, 남북통일기금이라는 ‘남북’개념을 넘고 또 현재 선진국 중심의 후진국 지원 公的(공적)원조(ODA) 개념을 넘어 무역거래가 많은 나라일수록, 자원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군비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국제거래세를 더 많이 징수해 국제기구가 공동관리하는 인류복지세(Global Welfare Tax 1979년 제안) 또는 지구촌평화세 같은 것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 지금 논의 중인 환경절약을 위한 탄소세나 금융 외환거래의 폭주를 막기 위한 토빈세(Tobin’s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편집자 주) 개념을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서뿐 아니라 세계사적 비교에서도 유례없이 폭발적인 한국의 불교·원불교·기독교 해외선교와 더불어 세계 주류가 될 수 있는 한국판 ‘21세기 적십자운동’ 한국판 ‘지구촌 평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 일본이 23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10년으로 가장 빨리 4만 달러 달성
崔聖煥
⊙ 1956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석·박사.
⊙ 現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하지만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초반부터 경제개발에 나서면서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상승국면으로 진입했다.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린 햇수는 빠르면 3년, 늦어야 6년이었다.
1974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1달러로 하루 1달러로 사는 나라로 올라선 데 이어 1977년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잘 극복한 후 88올림픽을 치르는 등 세계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망의 1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
불행하게도 1997년 말 초유의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 성장률까지 급락하면서 199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급속한 성장의 후유증 또는 成長痛(성장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년 만인 2000년에 1만 달러에 재진입한 데 이어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번에는 미국發(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한 해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만9000달러대에 이어 2009년에는 1만7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빠르면 2010년, 늦어도 2011년이면 2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과 ‘2’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위기를 맞으면서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사는 나라 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까? 또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는 돼야 한다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4만 달러를 주장하는가?
먼저 선진국의 의미와 특징을 짚어 보기로 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통계 수집이 가능한 182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을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49개국을 신흥시장국(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IMF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구분에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룹별 통계 작성의 편의상 크게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1997년 선진국에 편입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타이완, 체코, 포르투갈 등처럼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이하 2008년 기준)를 넘나들고 있거나 채 미치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반면 카타르(9만3000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5만5000달러), 쿠웨이트(4만6000달러), 브루나이(3만7000달러) 등처럼 3만~4만 달러가 넘는데도 신흥시장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는 곧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외에도 산업구조와 정치 및 사회적 특성도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신흥산업국(Newly Industrialized Asian Countries)’이라는 그룹으로 선진국에 처음으로 편입됐다.
그렇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33개국을 분석해 보면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1인당 소득수준을 살펴보자. 룩셈부르크가 11만3000달러로 유일하게 10만 달러를 넘고 있고, 타이완이 1만6987달러로 가장 낮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잘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의 소득수준이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슬로바키아, 타이완 3개국이고 2만 달러대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5개국이다. 3만 달러대가 8개국(일본,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등), 4만 달러대가 7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벨기에, 호주), 5만 달러대가 5개국(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다. 6만 달러가 넘는 나라도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있다.
33개국을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23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이 8개국, 북미지역이 2개국이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전부 유럽국가들이다. 이들 유럽국가는 ‘부자 옆에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부자 옆에서 부자 난다’는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앵글로색슨족이 정치 및 지도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유럽에서 이주해 갔거나 그 후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유럽국가와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IMF가 아시아 신흥산업국으로 분류하는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4개국과 일본만 남는다. 이 또한 후진국 또는 신흥시장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G7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라는 부자가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는 부자 나라가 옆에 없다는 점에서 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이라는 特需(특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눈여겨볼 나라는 G7 국가들이다. 일부에서는 아일랜드와 벨기에, 북유럽 3국 등 强小國(강소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인구 규모가 우리 경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말 그대로 小國(소국)으로 우리와 경제규모는 물론 산업구조, 노동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G7 중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인구가 각각 3억명, 1억2800만명, 8200만명으로 우리나라(4850만명)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6000만명 안팎으로 우리나라와 엇비슷하고 캐나다는 3300만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쟁상대국으로 봐야 할 나라들은 이들 G7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대에 몰려 있다. 3만 달러대에 있는 일본의 경우 2010년에 4만 달러로 올라서고, 이탈리아의 경우 2008년에 3만9000달러로 4만 달러에 근접했다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년간 3만 달러 중・후반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3년 만에 4만 달러 시대를 접고 2009년에 3만5000달러대로 내려앉았지만 2012년경에는 다시 4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에는 3만9000달러대로 떨어졌지만 2010년에 바로 4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80년대만 해도 G7 중 가장 뒤처지는 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따라잡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4년에 G7 중 가장 먼저 4만 달러에 진입한 데 이어 2012년에는 가장 먼저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까지 늘어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16.7년
G7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6.3년이다. 아직 4만 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의 평균이다. 일본이 29년(IMF의 전망대로 2010년에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계산)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20년으로 가장 단기간에 4만 달러로 올라섰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自國(자국) 통화인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없는 미국의 경우 26년이 소요됐고, 환율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5개국의 경우 평균 26.4년으로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환율이 달러표시 국민소득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10년, 20년과 같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의 기초체력(economic fundamentals)을 잘 반영하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어나는 데는 평균 16.7년이 걸렸다. 일본이 23년으로 가장 오래 걸렸고 영국이 10년으로 가장 빨리 4만 달러를 달성했다. 여기서도 미국이 16년 걸린 반면 나머지 5개국도 16.8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걸린 평균기간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보자.
우리나라가 1만 달러를 달성한 때가 1995년이므로 26.3년을 더하면 2021년, 2만 달러를 달성한 때가 2007년이므로 16.7년을 더하면 2023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G7의 선례를 따라간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2021~23년 사이, 늦어도 2025년경에는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3만 달러는 2015~2018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인가?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747(7% 성장으로 10년 내에 4만 달러 달성, 7대 강국 진입) 정책을 내놓았다. 737보다는 747이 더 크고 업그레이드된 비행기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임기중 3만 달러 달성이라는 단기적 구호보다는 10년 내에 4만 달러를 달성해 현재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생활수준을 만들겠다는 중장기적 구호가 더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1인당 소득 4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의 조건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8년 10월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이 되기 위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으로 ‘3만〜4만 달러’를 제시한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기를 예상하는 질문에는 41.7%가 ‘6〜10년’, 22.3%가 ‘5년 이내’라고 답해 앞에서의 추정과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서비스업 다양해져야
IMF가 분류한 선진 33개국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33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절반 정도인 17개국이다. 33개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20위권 이내에 든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경제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7이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었거나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4만 달러 선진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2020년경에 4만 달러에 진입할 때는 이들 나라 대부분이 5만 달러대(2020년경 미국은 6만 달러대, 이탈리아는 4만 달러대로 추정)로 한 걸음 더 나가 있겠지만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4만 달러의 의미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4만 달러가 되려면 두서너 개의 기업이나 산업으로만 경제를 이끌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먹여살려야 할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양해야 함은 물론 수출 또한 성장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처럼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현재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비중 확대를 통해 금융 및 보험, 의료와 복지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거나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이 미국의 60~70%, 서비스업 생산성은 미국의 30~60%에 불과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양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그 경제는 안정 성장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산업이 斜陽化(사양화)된다 해도 다른 산업이 이를 대체하면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복지 등에서도 여유가 생겨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 및 복지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상당기간 불황에 빠져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화 또는 균형의 원칙’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엔진도 여러 개가 되면서 내・외부 충격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흡수능력이 생긴다. 1990년대 초반 이후 10여 년간의 장기불황 속에서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유지하면서 ‘골든 리세션(Golden Recession·황금의 불경기)’이라고 불리는 일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4만 달러 정도가 되면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적으로도 두어 계단 상승하면서 보다 성숙된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경제가 저만큼 앞서가는 데 반해 정치와 사회・문화 수준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말하는 ‘조화 또는 균형의 원칙(Congruence Principle)’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서 사회 각 부문이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때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순위를 짚어보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5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서고, 그 뒤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뒤쫓고 있다.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이 8~10위에 포진하면서 캐나다가 11위로 물러났다. 인도, 멕시코, 호주가 12~14위를 차지한 데 이어 우리나라가 1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IMF의 2014년 전망에 따르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등 일부 순위가 바뀌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호주를 제치고 14위로 한 단계 올라서는 데 그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1조1670억 달러인 반면 10위인 인도의 GDP는 1조9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위와의 차이가 무려 6000억 달러, 60% 이상 나고 있어 2020년에도 10위권 내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2020년경에도 경제규모 순위는 15위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지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계산한 GNI’이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 하는 생산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다. 반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國籍(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전 세계를 오가며 벌어들인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소득지표다. 1990년대까지는 ‘국민총생산(GNP·Gross National Product)’을 많이 사용했으나 생산과 소득이 혼합된 지표로서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은 물가상승분을 포함하는 명목 국민소득과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국민소득으로 나누고 있다. 필요에 따라 명목 GDP와 실질 GDP, 명목 GNI와 실질 GNI 등으로 구분해 사용한다.
명목 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를 볼 때, 실질 국민소득은 경제성장(성장률)과 경기변동 등 규모의 변화 및 장기적 흐름을 볼 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2.9%라면 3분기의 실질 GDP가 2분기의 실질 GDP보다 2.9% 증가했다는 것, 즉 물가상승을 제외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생산이 2.9%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 GDP를 실질 GNI로 전환하려면 실질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을 빼거나 더해 주면 된다.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요소소득(임금과 배당 등)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서 가지고 나간 요소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수출·입가격(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입을 보여주는 항목이다. 최근처럼 油價(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지런히 생산해서 내다팔아도 남는 소득이 별로 없게 된다. 이 경우 통상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실질 GNI 증가율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던 2008년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2.2%였지만 실질 GNI 증가율은 -0.8%를 기록했다.
GDP와 GNI가 한 나라의 생산 또는 소득 규모를 보여준다면, 이를 인구 수로 나눈 지표가 1인당 GDP와 1인당 GNI다. 1인당 지표로는 생산보다는 소득지표가 더 적합하다는 점에서 1인당 GNI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인구 수로 나눈 것인데, 이를 다시 연평균 환율으로 나누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GNI가 되면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할 때는 통상 1인당 GNI를 의미한다.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계산한 GNI’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환율을 시장환율이라고 하는데, 한 나라 통화의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시장환율이 상품과 서비스 무역거래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통화의 구매력과는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을 기준으로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통화의 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율이 구매력평가 환율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쌀값은 우리나라의 20~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중국 사람들은 같은 1달러로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많은 쌀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나라일수록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GNI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중국의 시장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3259달러(2008년)이지만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5970달러로 거의 두 배나 높아지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1만9136달러지만 구매력평가 환율로 계산한 1인당 GNI는 2만7700달러로 45% 정도 높아지는 데 그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중국보다는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 유럽 강소국들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로 정신으로 무장한 문화 덕분
金成進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 1959년 경북 선산 출생.
⊙ 대구 계성고, 고려대 영문학과 및 同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 헝가리 학술원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꿈을 꿨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린 OECD에 가입하자마자 외환위기에 헛발을 디뎌 그대로 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절치부심 지난 10여 년을 부지런히 돌을 굴려 올렸지만 여전히 선진국 문턱에 머물고 있다. 시지프스의 악몽을 연상케 한다.
그간 주요 경제지표를 절대치로 놓고 보면 개선되긴 했다. 그런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이었다. 지금은 중턱을 오르내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 형세다. 다시 아래로 떨어지느냐 정상을 밟을 수 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영국의 정치가 처칠(1874~1965)의 정치 초년병 시절 이런 일이 있었다. ‘당선 확실’로 생각하던 선거에서 낙선해 주저앉고 말았다. 집안에 틀어박힌 채 그저 창 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건너편 건축 공사장에서 벽돌공이 일하는 게 보였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벽을 쌓아가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큰 담벼락이 나타났다. 처칠은 무릎을 탁 쳤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다.
사실 대한민국은 작고 촘촘한 벽돌이 아니라 공장에서 급조한 대형 시멘트 블록으로 성큼성큼 지어 올린 집이다. ‘압축 성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밑바닥에서 중진국으로 치고 올라오는데엔 더없이 완벽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높이 지을수록 곳곳에 바람이 숭숭 불어 들어오고 물이 샜다. 빨리 지을 수는 있었지만 높이 쌓을수록 약해졌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벽돌공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우리의 모범이 될 진정한 벽돌공들이다. 역사도 환경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만 그들의 정신을 접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떤 재난과 위기도 극복할 비책을 이미 역사의 지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킹 3형제인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그리고 베네룩스 3국으로 불리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에서 벽돌공의 지혜를 구했다. 초미니 국가이면서도 세계일류가 된 모나코와 안도라도 뒤져보았다. 작지만 강한 8개의 유럽 국가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았다.
분열하면 망한다
8개 强小國(강소국)은 유럽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널리 퍼져 있다.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조차 3만명(모나코)에서 1600만명(네덜란드)까지 제각각이지만 비집고 들어가 보면 약속이나 한 듯 국가를 움직이는 정신은 거의 같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본래 정당정치의 목적은 정권창출이다. 정권은 권력을 쥐어주며 정치인은 그 권력을 향유한다. 그래서 정치게임은 生死(생사)를 건 생존게임의 형상을 띤다.
그런데 이들 8개 강소국에서 정치는 主演(주연)이 아니라 助演(조연) 역할에 충실하다.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국민 복지를 높이는 데 더욱 열심이다. 조정과 통합의 ‘그림자 역할’에 사활을 건다.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건 맞지만 국민을 더 잘살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해 주는 치열한 경쟁에 더 가깝다.
정치가 이렇게 된 데엔 역사적으로 지녀온 위기의식의 역할이 컸다. 내부 정치세력이 분열되거나 파당이 생기면 작은 나라로서는 예외 없이 주변 강대국 침략의 빌미가 됐다. 그 뼈저린 역사의 교훈이 정치의 모습을 바꾸게 했다.
게다가 어떤 특정 정당도 유효득표의 50%를 얻는 경우가 거의 없어 연립정부 구성이 일상사가 됐다. 그러다 보니 주요 이슈에 대한 합종연횡이 상례화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제 설정·집행이 톱니바퀴 물려 돌아가듯 순조롭다.
한국 정치는 불행히도 사회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로 악명을 떨쳐 왔다. 정치의 파장으로 사회가 분열하고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의 위기의식 불감증이다.
한국사회 곳곳에 내재한 갈등 구조가 지뢰처럼 묻혀 있지만 정치인들은 애써 이를 외면한다. 오히려 갈등구조를 정치에 역이용하기도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는 자신의 차기 선거와 관련된 치적 쌓기에 더 열심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기회에 대한 냉정한 정치권의 각성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일방적 대립과 주장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진정한 복리를 위해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문화 구축 없이 4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갈등해결 시스템 완비
인간이 사는 곳엔 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21세기엔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사안을 놓고도 국민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 유럽의 8개 강소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다. 갈등을 통합·조정하는 관행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 기업, 사회, 국가라는 각각의 차원에서, 그리고 갈등의 심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 처방이 사회관행과 법·제도로 정비되어 있다.
유럽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했던 스웨덴에선 국가조사위원회(SOU)제도라는 갈등해결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느 정당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법안의 찬반에서 파급효과,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를 도맡아 하는 기관이다. 전문가도 포함되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한다.
勞使(노사) 갈등에 관한 한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고의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노사 갈등을 피하기 위한 2중, 3중의 해결 장치가 핵심이다. 1921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분규는 한 건도 보고된 적이 없다. 철강산업의 침체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철강회사 종업원들이 회사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한 1970년대에도 파업은 없었다.
기업단위, 산업 부문, 정부와의 ‘勞使政(노사정) 회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중재절차가 철저히 가동된다. 심지어 경영자들의 상공회의소를 상대하는 노동자회의소까지 구성되어 있다. 룩셈부르크가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된 기반이었던 금융허브 산업도 무분규의 역사를 써온 갈등해결 시스템이 그 비결이었다.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는 제도화, 그리고 이를 지켜나가는 문화의 정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갈등구조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꿈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한국의 부패지수는 전 세계에서 매년 40~50위권을 맴돌고 있다. 투명성은 곧 사회의 효율성과 상관관계다.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면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도 거의 불가능하다. 자원과 인재의 낭비가 도를 지나칠 수 있다. 대부분의 후진국이 항상 부패지수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이유다.
유럽의 8개 강소국은 예외 없이 유리처럼 투명한 사회를 만들었다.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지수를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 등이 9.3으로 가장 깨끗한 나라에 속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북해유전이나 수력발전 등 기간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은 공기업이다. 노르웨이 경제를 좌우하는 게 공기업이다 보니 정부의 리더십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국영기업체도 투명하고 부정이 낄 소지가 없다. 정부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유럽 강소국들의 일류경제 뒤에는 투명한 정부와 투명한 기업, 그리고 정직한 개인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앞서가는 공교육 시스템
유럽 8개국 정부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公(공)교육비를 지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를 교육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들 국가의 교육은 최근 독일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교육비 부담률은 4%대지만 민간 부담률이 거의 3%에 달한다. 게다가 私(사)교육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사교육시장은 팽창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8개 강소국의 교육제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손질해 가고 있다. 교육이 살아서 숨 쉰다. 교육이 다른 부문을 앞서나가며 우수 인재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다.
언어 교육만 봐도 교육의 질이 다르다. 룩셈부르크는 ‘완벽한 다중언어 사회’다. 50만명도 되지 않는 인구가 고유어인 레체부르크語(어)를 그대로 쓰며 보존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여기에 영어까지 모국어 수준으로 쓴다. “영어를 배우려면 네덜란드로 가라”는 얘기도 있다. 영국보다 영어를 더 잘 가르칠 만큼 교육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우수한 공교육제도는 富(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도 막아준다.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소득이 100% 일치할 경우를 1로 하고 완전히 부(혹은 가난)가 역전될 경우를 0으로 상정하면 미국은 0.54로 부모의 부나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될 확률이 50%를 넘는다.
그런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0.2에 머물렀다. 부모가 부자든 또는 가난하든 부모와 자식의 세대 간 貧富(빈부) 대물림이 가장 낮은 사회다.
우리의 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학입시를 맴돈다. 수능시험이 교육의 목적이 되다 보니 21세기형 창의적 인재양성은 구호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의 대학입시 승패는 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좌우한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모든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다시 교육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의 전체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프로정신이 살아 있는 사회
유럽 강소국들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가 정신으로 무장한 문화 덕택이다. 프로정신이 모든 분야에 뿌리 내렸다. 정치도 전문가들이 맡고 경제도 전문가들이 운용한다.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전문가들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행동을 전제로 극단의 國益(국익)을 추구한다. 그들에게도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차이는 전략적인 것이지 목적의 차이는 거의 없다. 처음도 끝도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이들 나라가 역사에서 배워 체득한 지혜이다.
벨기에는 작은 것이라도 늘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초콜릿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제품은 모두 벨기에에서 만들어지거나 벨기에 匠人(장인)들의 손을 거쳤다. 벨기에 맥주는 맛으로도 세계를 정복했지만 시장 점유율로도 세계 최고다.
중세시대인 1366년 창업된 인터브루는 최근 미국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버드와이저 생산회사 안호이저-부시까지 집어삼켰다. 이 회사의 맥주시장 세계 점유율은 25%나 된다. 한국의 세 개 맥주회사 가운데 두 회사도 이 회사 계열사다.
한국에 전문가정신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과잉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모든 분야의 우위에 있어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교수, 공무원,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선거철만 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사무실을 기웃거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前(전) 근대적 사회의 유산이 아직도 한국에 살아 있다.
더욱이 地緣(지연), 學緣(학연), 血緣(혈연)이라는 전근대적 커넥션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보다는 이른바 ‘좋은 대학’을 고집하는 이유도 실은 그 대학이 가진 학연에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프로정신이 살아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프로페셔널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전문가 정신이 고취되어야 한다. 각 분야의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프로정신만이 4만 달러의 선진국을 약속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 8국은 역사와 환경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며 자신들만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왔고, 또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들 8국 중 어떤 나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전례가 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가진 지혜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가져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1960~70년대 한국식 모델처럼 이제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 모델을 만들어 도전할 때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8개 강소국의 지혜는 새 모델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만 달러 달성 목전에 둔 일본의 교훈
첨단기술+감성의 융합=세계시장 확보=성장
⊙ 농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
廉東浩 일본 호세이대 비교경제연구소 겸임연구원
⊙ 1966년 광주 출생.
⊙ 경희대 졸업. 일본 호세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장래 역사라는 법정에 설 각오는 되어 있는가?”
2009년 11월 24일, 2001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노요리 료지(野依良治) 일본 이화학연구소 이사장이 일본 민주당 정권을 향해 大怒(대로)했다. 국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과학 분야 사업의 폐지 및 예산 삭감을 잇달아 결정한 데 따른 원로 과학자의 꾸지람이었다. 과학 예산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정치가들에 대한 일갈을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일본 전체가 한순간 멈춰서는 듯했다.
국가의 미래와 성장에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무엇이 비용이고, 무엇이 투자인지,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미래는 이 고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GDP 4만 달러를 목전(3만8559달러)에 둔 일본이 심한 독감을 앓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대 금융자산을 보유한 채권국이 앓고 있는 독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감 요인을 “政(정)·財(재)·官(관)의 유착과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낡은 성장방정식”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이끈 성장방정식은 ‘첨단기술=경쟁력=성장=고용창출’이었다. 현재 이 성장방정식은 상대적 빈곤율 15.7%와 低(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낳는 한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유발하며,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병든 방정식이 되어 버렸다.
GDP 2만 달러를 눈앞에 둔 우리는 어떤가?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 10.5%에서 2008년 14.3%로 8년간 3.8%나 증가했다. 취업 애로층은 300만명에 달하며, 단기 취업자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산업 현장의 비정규직은 30%를 넘어섰다. 바로 新(신)개념의 빈곤층이 탄생한 것이다. 출산율 또한 1.22명(선진국 평균 1.64명)으로 전 세계 186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신개념의 빈곤층과 低(저)출산율은 미래 4만 달러로 가는 길에 반드시 털어내야 할 최대 걸림돌이자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첨단기술=경쟁력’의 시대는 20세기의 유물이라고 하지만, 첨단기술은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른 여름날의 우물물이다. 여기에 ‘첨단기술(하이테크) + 감성(하이 콘셉트)의 융합=세계시장 확보=성장’이라는 방정식이 필요하다.
반도체, 액정TV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정상에 올랐다고는 하나, 21세기형 산업구조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소재 산업과 에너지 산업 등 극복해야 할 장벽은 높다.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창출에 세금 써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지속적인 성장에서 가장 큰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정책도 바꿔 말하면 세금의 쓰임새를 의미한다. ‘성장’과 ‘분배’의 논리가 아니라, ‘비용’과 ‘투자’의 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新(신)빈곤층과 양극화라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용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세금을 써야 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세금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설비투자(10억원)를 늘리면 세금(1억원)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10여 년 전만 해도 대기업이 10억원을 투자하면 5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세계화된 우리 대기업들은 국내투자보다는 인건비 등이 싼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탕감된 세금으로 자동화를 추진한다. 50여 명에 달하던 일자리는 이제 10명의 밥그릇을 확보하는 것도 버겁다. 그만큼 세금의 고용창출 효과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계화된 기업은 한국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한 예로 STX(조선 해운업)그룹을 보자. 이 그룹의 사원 4만7000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4000명 수준으로 8.5% 남짓에 불과하다. 단순 비율로 보면 1억원의 세금이 투여되었을 때 한국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혜택은 0.7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이제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위해 세금을 쓸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4대 보험 부담만 해결되어도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호소한다. 한국인 신규 고용 한 사람당 한 달에 100만원씩만 지원한다면 세금 1억원은 9, 1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단순계산으로 대기업 0.7명과는 극명한 차이다. 이들이 다시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수 진작 효과도 대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계산이다.
일본의 에너지 로드맵
경제성장에 물처럼 중요한 것은 에너지다. 일본은 1970년대 1, 2차 석유 쇼크를 거치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 결과 배터리나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섰다.
일본은 벌써, 2030년까지 기술개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다. 태양광 발전 코스트는 46엔/kWh에서 2030년 7엔/kWh로 줄인다. 2040년쯤에는 양자 나노형 등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구조와 재료의 태양전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은 2020년에 현재의 3배로, 2030년에 7배로 늘리고, 배터리 비용은 2020년에 1/10배로 2030년에는 1/40으로 줄인다.
이대로라면 20세기 중동에 의존했던 에너지를 21세기에는 일본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발전과 송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태양광,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 선진화된 원자력발전으로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고도도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나아가 바이오매스에서 대체연료를 얻을 수 있는 산업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기초과학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07년 18조9438억 엔. 민간 주택투자(18조9675억 엔)와 공공투자(21조8534억 엔)에 필적한다.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기초연구 8027억 엔, 응용연구 2조4965억 엔, 개발투자 9조4285억 엔이다. 이처럼 매년 줄고 있는 기초연구를 공적연구개발투자 기초 1조5523억 엔, 응용 1조2582억 엔, 개발 9339억 엔으로 보완하고 있는 형태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연구개발의 효력이 단기화되고, 기초과학에서 응용 및 개발로 연구비가 옮겨가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신사업 개척을 담당했던 기업 연구소의 연구 내용과 역할이 본업 지원형으로 바뀌면서 일본 제조업의 수익구조 악화가 정착되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라 아니할 수 없다.
농업의 산업화
인구 4500만명의 그리 크지 않은 우리로서 세계시장 확보는 절대적인 과제다. 그래서 FTA가 지지를 받는 것이고,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자 비켜갈 수 없는 대세다. 여기에 커다란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업이다. 그러나 식량의 70%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우리로서는 농업은 걸림돌이 아니라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 모든 경제교섭에서 농업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단지 농업종사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장래 일본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보고서(2009)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세계인구는 7970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이 속도로 가면 2010년에는 70억명을 돌파한다.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려면 곡물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저성장 성숙사회로 진입한 일본이 농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산물은 더 이상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제품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일찍이 남극기지에까지 야채공장을 만든 일본은 기업형 농업으로 버섯을 콘크리트 건물 야채공장에서 연간 14모작을 해내고, 땅속에 최첨단 칩을 묻어 비닐하우스의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농장을 만들었다. 바로 첨단기술과 기업의 자금력과 경영 노하우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다
⊙ 남북통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를 G20으로 확대, 거부권 폐지하고 다수결제 도입해야
金昌準 前 미국 연방하원의원
⊙ 보성고 졸업.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토목공학과, 同 대학 행정대학원 졸업.
⊙ 1961년 渡美, 건축설계회사 제이킴엔지니어링 사장, 다이아몬드 시장, 미 연방하원의원(3선),
연방하원 교통건설소위원장, 공공건물 및 경제개발소위원장 역임. 現 경기도 명예대사,
한국경제신문 고문.

| <한미 FTA는 무역 의존도가 85%가 넘는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정이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에 있는 수출부두.> |
현재 우리의 국민 소득은 지난 몇 년 동안 1만8000~2만 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필자는 3만 달러는 노력 여하에 따라 5~1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4만 달러는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3만 달러 선진국 시대를 열면 이후의 4만 달러 시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3만 달러의 고지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사실 국민소득 3만 달러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먼저 우리(대한민국을 칭함)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韓美(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85%가 넘는 무역의존도를 가진 나라다. 무역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비록 현재 우리의 무역 상대국 1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다. 우리는 일찍 이런 초강대국과 무역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 FTA는 무역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우리가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현재 미국이 한미 FTA의 국회 통과를 늦추는 것은 미국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부터 미국 경기는 회복기로 들어갈 것이고, 건강보험 개혁안도 下院(하원)을 통과했으니, 미국 의회는 2010년 2~3월부터는 한미 FTA 문제에 신경을 집중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물건 팔려면 반드시 상대방 것도 사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다. 이번에 FTA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 측에서 볼 때 한미 FTA의 문제점은 자동차 부문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은 민주당 상원의원 시절 “한국은 2007년 75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지만, 미국은 높은 관세장벽 때문에 6300대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그쳤다”며 “한국 자동차 시장은 가장 폐쇄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한미 FTA 협정을 비난했다.
자동차 관련 정확한 정보 미국에 알려야
미국의 자동차 노조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한국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인들에게 FTA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으로 FTA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 의회의 원활한 FTA 통과를 위해서는 미국의 한미 FTA의 거부감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은 추가 협상 대상으로 제외해 놓고, 미 의회에 FTA 통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국에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 차가 겨우 6500대만 팔렸다는 주장을 막아야 한다. 즉 한국은 GM 대우와 미국 앨라배마 현대 공장에서 판매하는 차를 모두 미국 자동차 판매 대수에 포함해 미국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미국에 수출했다는 75만대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에 5년 내에 자동차 공장을 하나 더 짓겠다”고 제안하면 미국이 주장하던 자동차 수출입 숫자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추가 협상 시기도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이 미국이 준비되는 때를 기다려서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 내 FTA 통과를 위해서는 재미 교포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교포들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하고, FTA 통과를 위한 로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때문에 이들 교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정부의 전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미 FTA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국의 국회와 정치의 근본적인 정상화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가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형적인 후진국 정치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구 주민에게 돌려줘야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은 현재 중앙당이 독점하는 공천권 제도를 없애고 공천권을 지역구, 즉 국민에게 하루속히 돌려주는 것이 급선무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는 것은 대의정치에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면 가장 간단하다. 우리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 선진국은 국민투표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한다. 그 밖에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지역구가 있어야 한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는 三權(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경우 반드시 사표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북한 문제다. 정부는 무엇보다 뚜렷한 對北(대북)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복잡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통일정책’이다.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북정책의 A이자 Z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간단하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 이를 테러국가에 팔거나 핵기술을 넘기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따라서 이것을 막겠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대북 문제의 현안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을 망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변 정세가 이러한 때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 통일비용이니 뭐니 하면서 하도 떠드는 통에 국민 사이에는 통일 공포증까지 생겼다. 통일을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통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도 강대국도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국토 크기나 인구 크기로 봐서 성장 잠재력도 한계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 통일 없이는 현재 수준에서 우리의 위상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을 개혁해야 통일 가능
그렇다면 어떤 통일인가?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흡수통일을 말한다. 2대 세습에 이어, 3대 세습을 하려고 하는 북한은 자체 헌법이 통하지 않는 정통성 없는 임의 조직에 불과하다.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북한을 법치가 완성된 우리가 흡수 통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너무나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남북통일은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몇 백만 명의 주민을 살리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통일하면 북한의 핵위협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인 북핵문제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즉 우리의 통일은 人權(인권)과 핵위협이라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이자,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리면 상식이 있는 국가는 남북통일을 절대로 반대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유엔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체제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현재의 유엔 체제는 2차대전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60년 전에 정해진 다섯 나라만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다섯 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영원히 유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국가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개 나라가 찬성을 해도 다섯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무위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상임이사국을 해체하고 이들 나라를 주요 20개국(G20) 안으로 흡수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유엔을 G20 체제로 전환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남북통일 안건은 70% 이상의 지지로 통과될 수 있다. 앞서 말한 통일의 명분을 반대할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가 G20 의장국이 됐다.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 북한이 3대 세습체제에 들어가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때 가서도 만약 현재의 상임이사국 체제가 유지될 경우 중국의 거부로 모처럼 맞이한 통일의 기회가 허무하게 날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재미 교포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 활용 문제에 대해 한마디하고자 한다. 필자는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그동안 해외 교포들은 단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해 왔다.

재외 교민에게 참정권 부여는 잘한 일
교포들은 본국의 투표권도 없고, 현지의 투표권도 없으니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시민의 가장 큰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온 것이다.
해외 교포 참정권 부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국 정부도 투표권이 있는 해외 교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민들은 본국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교민 중에는 귀국해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한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둘째, 참정권은 교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물론 교민들의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교민들이―그것도 될 수 있으면 1세들이―필자처럼 직접 현지의 정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필자도 교민들이 미국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GDP 4만 달러 달성의 걸림돌-남북관계
북한 급변사태 대비하고 통일외교 전개해야
⊙ 한반도의 운명을 국제여건에만 맡기면 통일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
⊙ 중국이 북한 붕괴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 중국의 적극개입을 통해
북한은 개혁·개방과 붕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金錫友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 1945년 충북 논산 출생.
⊙ 서울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국제법 석사.
⊙ 외무부 아주국장,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同 의전수석비서관, 통일원 차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역임.

| <1990년 10월 3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독일 국기를 흔드는 독일인들.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통일외교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
분단 이래 오랜 기간 ‘북한 리스크’는 한국의 장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정치민주화까지 달성해 강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1972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 이제는 GDP에서 북한의 40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 한국은 대청해전에서 보듯 첨단기술과 경제력의 뒷받침 아래 국방력에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韓美(한미)동맹까지 더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북한 정권은 1990년대 동구권 붕괴와 냉전체제 해체에도 불구하고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해 왔다. 그 결과 더 곤경에 빠지게 된 북한은 마지막 생존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행동하지 않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어느 주변국이 용납하겠는가? 오로지 북한과의 관계를 脣齒(순치)관계로 보는 중국만이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남북 간의 균형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남북관계’가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金正日(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父子(부자)세습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북한사회의 치안 악화, 대규모 餓死(아사)사태나 탈북자의 대량 발생과 같은 격변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東北亞(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과연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라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면 그 충격으로 남한도 곤경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金大中-盧武鉉(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논리였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북한 정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여기에는 선동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북한 붕괴 시에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분단관리비용보다 싼 통일비용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통일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다만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심리적 공황상태나 혼란을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초기 소요비용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됐다.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을 끝도 없이 지원하려는 시도야말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때문에 남북관계가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적극성이다.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급변사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년 전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좋은 先例(선례)가 된다. 예컨대 兩獨(양독) 간 통화 교환비율, 분단 전 토지소유권 인정, 분계선의 개방 문제 등을 한반도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경우,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긴급 비상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는 데는 연간 수억 달러면 충분하다. 한국 GDP의 1%로 북한 GDP의 40%에 해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 해결과 통일 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와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만명에도 못 미치는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지 못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 과정에서 남과 북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해 줄 귀중한 人的(인적) 자원이다.
둘째, 우리 사회 내의 이념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지난 두 정권 10년간 남북 화해와 민족공조라는 명분 아래 親北(친북)세력이 확산됐다. 이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켜 젊은 세대의 통일 의욕에 찬물을 끼얹었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같은 反美(반미)데모를 벌였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명이 다해 가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그와 연계됐던 친북세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북한 급변을 통일기회로 만들어야
셋째, 정부 당국은 북한 급변사태가 분단 고착화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국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주변국들은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自國(자국)의 이익계산 때문에 분단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국제여건에만 맡기면 통일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에 호의적인 미국은 中東(중동)문제나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만 중국의 협조를 얻어 제거한다면,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선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한국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 소극적일 경우 통일의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주변 정세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넷째, 동북아 지역은 역사적·지리적 이질성 때문에 유럽과 같은 多者(다자)안보체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 내 안보와 평화는 주요국 간의 力學(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협의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유용한 협의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지역 내 다자안보기구로 발전시켜 兩者(양자)적 안보체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재의 세계질서는 엄연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전 세계 GDP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최상의 교육과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이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 이제 한국은 지난 정권 10년간 훼손됐던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도 테러방지, ODA(공적개발원조), PKO(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같은 분야에서 능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한미 간 신뢰를 확고하게 해야 한다. 그러한 신뢰를 기초로 해야만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 간의 협력을 완벽하게 하고, 주요국에 대한 설득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 통일외교 펼쳐야
여섯째, 1992년 8월 韓中(한·중) 수교 후 한중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발전했다. 경제면에서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교역대상국이 됐다. 인적 교류 면에서도 한국인이 연간 400만명으로 중국 입국여행자의 첫 번째가 됐다. 양국 경제 관계는 상호보완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한국으로서도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중 관계에 걸맞게 양국 간 대화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는다는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급변사태 처리 후 미군이 압록강·두만강 국경선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전략협의를 거쳐 미국이 중국을 함께 안심시켜야 한다. 2005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여덟 번 열렸던 미·중 전략대화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 붕괴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되면, 중국의 적극개입을 통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든가, 아니면 붕괴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곱째,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로 귀결되도록 일본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공유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외국인 납치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텐데, 이때 일본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는 냉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졌으나, 地政學(지정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한반도 통과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인구가 적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도 한국의 참여가 절실하다.
서독 통일외교의 교훈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서독은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얻어 영국·프랑스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했다. 서독 정부의 주도면밀한 주변국 외교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의 한가운데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서독 정부가 민족자결권을 주장하여 통일을 달성한 지혜를 우리도 발휘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를 우리의 능동적인 대비와 주요국의 협력으로 잘 수습하면, 한반도의 분단해소와 통일실현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되고, 이는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적자원과 자연자원이 남한의 자본·기술과 제대로 합쳐진다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로 한국은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 중반에는 전 세계 G7 안에 들어가는 强國(강국)이 될 것이다.★
4만 달러 위한 유럽 기업인의 시각
FTA는 4만 달러로 가는 고속도로
⊙ 韓-EU FTA는 양자 무역을 30~4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 한 국가의 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효과 없어
장 자크 그로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프랑스 출생.
⊙ 국제비즈니스대학(Ecole Superieure du Commerce Exterieur de Paris), 베이징 외국어대 졸업.
⊙ 유럽 비즈니스 기구 회장,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장(한국), 現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 중 한-EU FTA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국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경제를 발전시켰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發(발) 금융위기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극복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09년 10월 15일 자유무역협정에 假(가)서명했다. 이로써 양측은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한국과 EU 양측의 비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FTA가 언제 발효될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EU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이 2010년 안에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EU는 한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다. 약 5억 인구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는 2008년 12조5000억 유로(18조67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세계 총 GDP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또 EU는 전 세계 상품 무역의 17%, 서비스 무역의 28.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다.
2008년 한-EU 양측의 총 상품 무역은 EU의 전 세계 총 무역의 2.3%인 650억 유로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인도, 브라질을 앞지르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EU의 4대 교역파트너 자리를 차지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양자 교역은 2007년 110억 유로를 넘어, EU 총 서비스 무역의 1.3%를 차지했다.
EU는 1962년 이후 2008년까지 누적 규모로 한국에 320억 유로를 투자했다. EU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상당한 신뢰를 보이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EU 기업들은 많은 한국인에게 매력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존경받고 있다.
한-EU 간 수출입을 포함한 상품 무역은 지난 2년간 약간 주춤했지만 2000년대 들어 첫 5년간 견고한 성장을 보였다. 2008년 한국과 EU의 양자 무역 총 규모는 650억 유로를 넘어섰고 한국은 EU의 제8대 교역 파트너 자리를 유지했다. 2004년과 2008년 사이 양자 교역은 연평균 7.5% 성장, 그 결과 EU의 對韓(대한) 무역은 EU 총 역외 거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EU의 다른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교역량보다 더 높다.
한국은 EU의 8대 교역 파트너
EU의 대한 수출은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2004년 이후 연평균 9.3%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EU의 평균 수출 증가율인 8.3%를 웃도는 성장률이다. 결과적으로 EU의 총 수출 중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EU FTA는 양측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게 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양자 무역을 30~4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EU FTA는 선진화된 무역 원칙과 규칙을 도입하고 무역 장벽을 차단할 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非(비)관세장벽을 낮출 것이다.
한국 내에서 유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한-EU FTA를 환영하고 있다. EUCCK는 무역 장벽을 낮출수록 무역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다.
EU 기업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EU 측에서 볼 때, 한-EU FTA는 동아시아의 방대한 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에서 볼 때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되는 토대를 마련해 줄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한-EU FTA를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자, 새로운 파트너십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FTA는 항상 양자에게 어느 정도 조정비용을 물린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FTA는 강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측에 다 이익을 줬다. 다른 나라들이 FTA를 체결한 전후 무역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FTA 협상 체결 당사자 사이에 무역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한 규제가 외국 투자자 발목 잡아
FTA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임은 확실하지만, 나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 목표를 성취하는 열쇠는 세계 선진국과 대등한 기준 설정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달렸다. 기업 친화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다. 즉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 법이 유효성을 상실할 때, 더 이상 행동에 대한 규칙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한국은 공무원들이 재량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복잡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들이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나아가, 관리들은 법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법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이고 임의로 집행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한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체의 시장 접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금융서비스업체가 세계적 모범 관행에 토대를 두고, 자신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장 내에 틈새 전문가의 진입과 성장을 허용하면서 분업형 금융서비스(unbundling)를 허가해야 한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통신, 교육, 의료, 법률, 컴퓨터 서비스 등 모든 주요 서비스 부문을 자유 경쟁에 맡겨야 한다. 정부 조달 프로젝트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된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서비스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문제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요구조건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업 유치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여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물의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단속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모든 분야에서 국제 기준과 시험 절차의 완전한 적용도 필수적이다. 중복 테스트 요구를 철폐하고 국제 기준의 실험실 혹은 실험 시설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를 승인해야 한다. EU가 승인한 테스트 기관 및 인증 기관이 한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5.6%로 2004년 OECD 보건 지출 평균인 8.9%보다 훨씬 낮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약제비 합리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적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총 의료지출에서 이용자 본인 부담률이 37%로 2004년 미국의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약제비 합리화 계획은 절대 다수의 한국인에게 효과적인 新藥(신약)에 대한 접근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 EUCCK는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기금 지원이 궁극적 비용 절감을 낳고, 예방 치료와 포괄적 치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입원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적하고 싶다.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 변화 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규제 시스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EU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전략을 공식화하고 명백한 단계별 목표가 포함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SME) 지원 문제다. 연구 지원금, 세제 인센티브, 연구 집약적 중소기업 클러스터 형성, 중소기업의 産學硏(산학연)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벤처 자본과 기술 펀드에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때 한국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소득 4만 달러의 꿈을 이룬 도시 울산·구미·거제 탐방
企業 유치가 도시의 소득수준 결정
⊙ 울산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 造船, 석유화학의 첨단화만이 살길”
⊙ 구미 “세계 IT 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변신 중”
⊙ 거제 “4만 달러와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은 시간문제”

| <울산 현대자동차의 3공장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생산라인의 모습.> |
우리나라에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도시는 울산(시장 朴孟雨·박맹우)과 구미(시장 南洧鎭·남유진) 정도다. 이 두 도시는 우리나라 전국 평균 국민소득인 2만 달러의 두 배가 훨씬 넘는 4만5000달러 수준이다.
이 두 도시 뒤를 3만 달러대의 거제(시장 金汗謙·김한겸)시가 뒤따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면 충청남도가 3만6000달러 수준으로 울산과 구미에 이어 전체 국민소득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도시의 특징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企業都市(기업도시)라는 점이다. 울산은 造船(조선)과 자동차・석유화학, 구미는 전자, 거제는 조선 산업이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울산, 구미, 거제와 같은 대규모 기업도시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는 방증이다. 4만 달러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울산, 구미, 거제의 현재를 취재했다.
[울산] 명실상부한 한국 최대의 기업도시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단일 도시로는 가장 생산력이 높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도시다. 현재 울산의 1인당 국민소득은 4만8000달러로 전국 최고다. 2008년 울산의 총 수출액은 78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7%를 차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연봉도 전국 평균 3000만원의 1.5배가 넘는 4752만원으로 역시 전국 1위다. 다만 광업·제조업의 생산액은 166조8000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전국 최고 소득수준의 도시답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통계도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울산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수는 인구 1만명당 168명(전국 평균 308명)으로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293대(전국 평균 252대)로 전국 1위, 인터넷 이용률은 83.6%(전국 평균 74.2%)로 전국 최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주택보급률은 7대 도시 중 최고 수준이다. 통계 수치뿐 아니라 2009년 도시브랜드 가치 조사에서 울산은 14조8000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최고 소득수준 도시답다. 2007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거주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울산이 1위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2009년 조사한 <울산시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10명 중 3명은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고, 10명 중 6명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는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20여 개 있으며,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에너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숫자는 42개로 2.4%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의 생산액은 79.2%를 차지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내에 탄탄한 중소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협력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울산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중소기업 전체 숫자는 1715개이지만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 관련업종이 대부분이다. 이 세 주력산업 중 자동차가 전국의 21.5%, 조선이 14.6%, 석유화학이 4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세 산업이 울산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2%에 이른다
3대 主力 산업의 첨단화 진행 중

―현재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은 머지않아 한계를 맞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성숙기를 지났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는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3000만 대에 이릅니다. 또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서 범지구적인 구조개편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조선은 세계적 공급능력 과잉과 경기침체로 수주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화학도 중국 때문에 향후 수출량의 감소가 우려됩니다. 울산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주력산업의 고도화·첨단화·다각화를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박맹우 시장에 의하면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동차의 경우 생산과 R&D, 물류가 결합된 오토밸리를 조성했고, 자동차 부품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오토밸리를 친환경자동차 연구의 메카로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조선 산업은 부족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을 설립했고, 자동차·조선기술관도 건립했다. 그밖에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플랜트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다. 화학분야는 일반 범용화학에서 정밀화학, 바이오화학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녹색산업 도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다른 도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임기 중에 태화강 살리기에 성공해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 성공으로 외부에서 울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울산은 전국 에너지 12.5%, 온실가스 배출량의 10.4%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도시입니다. 녹색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죠. 우리의 녹색산업도시 추진 전략은 에너지와 자원절약도 포함되지만 적극적으로 녹색기술을 개발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울산시는 친환경 청정기술센터와 신화학실용화센터 건설 등 녹색산업 육성과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미] 市政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
구미를 방문한 필자는 시청 홍보담당관실의 안내로 구미시 곳곳을 둘러보았다. 구미시 투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이었다. 강을 따라 수km에 걸쳐 펼쳐진 백사장을 보니 외부에 구미가 단순히 공업도시의 이미지로만 알려진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변을 따라 잔디 축구장 10개를 비롯하여 각종 시민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었고, 강 동쪽 구미공단 3단지 앞 강변에는 10km의 산책로를 가진 동락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구미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水邊(수변) 도시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았다. 우리나라 도시의 공통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특색 없고, 삭막한 콘크리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미시는 구미를 녹색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매년 100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꽃밭 가꾸기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총연장 342km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내외에 경관이 수려한 금오산(976m)과 천생산(407m), 유학산(839m)이 병풍처럼 구미를 감싸고 있고, 朴正熙(박정희) 대통령 生家(생가)까지 있어 관광 휴양 도시로도 손색이 없는 상태다.
구미시의 면적은 625㎢로 서울보다 10㎢가 더 넓다. 2009년 현재 인구는 39만명이며, 평균연령은 33세다. 구미에는 대기업 50여 개를 비롯해 19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으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7만7000명에 이른다.
2008년 구미의 생산총액은 59조원이다. 이 가운데 수출은 342억 달러를 기록, 전국 수출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31억 달러다.
구미에는 현재 4개의 국가산업단지(4단지는 공사 중)가 있다. 여기에 더해 2014년까지 조성예정인 5단지(10㎢, 330만 평)와 경제자유구역(6.24㎢, 189만 평), 배후지원단지 등이 완공되면 구미공단은 전체 43㎢(1350만 평)에 이르는 내륙 최대의 공단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미의 主力(주력) 생산품은 輕薄短小(경박단소) 형 첨단기기 제품이다. 휴대전화, LCD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IT 제품이 구미 수출 비중의 75%를 차지한다.
특히 구미에는 삼성과 LG의 생산기지가 몰려 있어 이들 두 기업이 구미 전자산업을 견인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LG만 하더라도 총 20만㎢(6만 평) 부지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마이크론 등 계열사 7개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연간 12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미시의 유별난 기업사랑
구미의 현재 국민소득은 4만6000달러 수준이다. 뉴욕(4만7000달러), 파리(4만6000달러) 등 해외 주요 도시권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그만큼 구미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다.
기업이 살아야 구미가 살기 때문에 구미시의 기업 지원 정책은 유별나다 싶을 정도다. 시에서는 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2006년 시장직속 기구로 ‘기업사랑본부’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부서에는 단장 아래 기업지원팀·기업육성팀·기업애로대책팀이 있으며, 2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그동안 1125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해 1113건을 해결해 주었다.
구미시는 2009년 1월부터 ‘위 투게더(We Together) 운동’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미시장의 중재로 회사, 노조,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 경기가 어려울 때 회사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을 해고하지 않기로 하고, 노조는 임금동결이나 감봉을 받아들인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구미시는 이 운동에 동참한 중소기업 442개 사에 1218억원의 고용유지 특별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위 투게더 운동에 동참한 기업에서 103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안정뿐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지원 사업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박람회, 기업 전자카탈로그 제작, 국내기업 마케팅,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구미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산기지 도시’에서 ‘과학기술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2007년 ‘구미 디지털 전자정보기술단지’가 완공됐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이들 연구소는 기업의 IT분야 R&D(연구개발)를 지원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집중적인 연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과학연구단지,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구미는 한국이 아닌 세계 IT산업의 실질적인 메카로 우뚝 설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면 기업 저절로 몰려올 것

―평소 구미를 ‘창끝 도시’라고 많이 표현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구미가 한국경제의 ‘창끝’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미는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미는 남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면서 항상 경제의 첨단을 달려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미 5공단과 부품소재 전용공단, 디지틀산업지구도 정부가 구미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정책 최일선에는 항상 구미가 있고, 세계로 나가는 첨병 도시이기 때문에 창끝 도시라고 한 것입니다.”
―임기 중 4조2000억원어치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비결이 무엇인지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외국기업 5개에 국내기업 11개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3개 기업이 투자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5조원을 넘을 예정입니다. 저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외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10번 정도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 시장이 발로 뛴 만큼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만 달러의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내에서 소득이 최고로 높은 도시의 하나라는 위상에 걸맞게 그 수준에 맞는 모델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구상 중인 녹색도시 계획이 마무리되면 10년 후 구미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남 시장은 “근로자들이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살기에 편한 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업이 올 것”이라며 “구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善(선) 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국민소득도 높아지는 이상적인 경제구조를 갖춰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문화와 체육시설 등의 복지시설이 꾸준하게 확충되어야 합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살기 좋은 구미와 함께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제] 造船으로 3만 달러의 꿈 이루어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12월 23일, ‘메러디스 빅토리’號(호)가 함경도 興南(흥남)부두를 떠났다.
자유를 갈망하는 1만4000명을 태운 이 화물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배’로 기록됐다. 12일 동안 약 10만명의 피란민을 구해내 세계 전쟁史(사)에서 최대 인도주의적 작전으로 평가받는 ‘흥남철수작전’의 남한 종착지는 다름 아닌 거제도였다.
경남 거제시 시청로에 위치한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엔 당시 작전에 대한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 모양의 조형물 옆으로 배에 기어 올라타는 피란민의 동상이 숙연함을 더해 준다.
60여 년 세월이 흐른 현재, 전쟁의 참혹함은 더 이상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2, 3위의 조선소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이 자리 잡았고, 한해 수출액 175억 달러(2008년 기준)를 기록해 한국 조선해양산업 수출액의 41.5%, 전체 수출의 4.2%를 담당하는 산업도시로 변신했다.
수입은 총 69억 달러로, 106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2008년 한국의 무역수지가 133억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다. 현재 거제시의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를 크게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 이후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2006년 10월 20만명을 돌파한 거제시의 2009년 10월 말 현재 인구는 23만2000여 명이다. 2008년보다 5.3%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 0.72%를 크게 웃돌았다. 매월 5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가운데 45%가 신생아다. 출산율 1.78명(전국 평균 1.19명)의 ‘젊은 도시’다. 주택보급률이 101%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데다,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 추이는 6.1%로 전국평균 2.2%를 크게 웃돌았다.
2009년 11월 30일에 찾은 거제시는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섬 곳곳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대형 마트, 그리고 밤거리를 환하게 비춘 간판 불빛들은 모두 도시의 풍요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취재에 동행한 황정재 거제시청 공보감사담당관의 설명이다.
“매일 아침 兩大(양대) 조선소 앞 출근길 모습은 말 그대로 壯觀(장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가득한 중심도로는 거제시의 젊은 열기와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보여주죠.”
거제시의 조선산업 종사자 수는 5만1700여 명이다. 가족 등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약 15만명으로, 거제시 주민 10명 중 7명은 조선업과 관련된 직장인 또는 그 가족인 셈이다. 거제 내 양대 조선소가 지급한 인건비는 2007년 말 기준 2조7900억원에 육박한다. 근로자 1인이 연간 평균 5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남 남해안 중부에 있는 거제도는 10개의 有人島(유인도)와 64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거제시의 本島(본도)다. 제주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동쪽으로 부산 가덕도가 직선거리 9km에 있고, 서쪽으로는 통영시와 거제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다.
1970년대까지 거제는 半農半漁(반농반어)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섬이었다. 외지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10명 중 9명이 통영이나 창원에 산다고 하던 시절이 끝난 것도 불과 10여 년 전부터다. 1971년 개통된 길이 740m의 거제대교가 육지와 거제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1000만 관광객 유치하겠다”
가난의 서러움을 딛고, 落後(낙후)된 섬을 눈부신 성장의 ‘잘사는’ 도시로 바꾼 것은 다름 아닌 ‘기업’이었다. 1973년 10월 대우조선해양이, 1974년 8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각각 설립됐다. 1970년대 말까지 도크 건설을 1차 완료한 두 회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었다.
오일쇼크, 원화절상, 노사분규 등 경쟁력 약화 요인이 있었지만, 한국은 당시 세계 최대 조선산업국이었던 일본과 함께 경쟁하면서 수주량을 끌어올렸고, 이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최근 불어닥친 세계 금융 위기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호황의 활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30만㎡ 부지에 건설된 6개 대형 도크엔 수출을 기다리는 선박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2009년 전체 수주잔량에서 중국에 추월당하는 등 ‘세계 1위’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기존에 확보해 놓은 계약분과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동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홍보파트장의 설명이다.
“저희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과 LNG-FPSO(부유식저장설비), 쇄빙유조선 등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신규수주가 급감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제작을 비롯해 풍력발전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도 진출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성장은 곧 거제시의 성장이었다. 1999년 4월, 제2의 거제대교인 길이 940m의 왕복 4차선 新(신) 거제대교가 개통됐다. 해상으로는 부산연안부두와 진해에서 거제도行(행) 배가 운항되기 시작했다.
조선업의 호황은 관광 호황으로 이어졌다. 거제도는 해금강, 외도, 지심도, 내도 등 ‘거제 8경’과 해발 500m 내외의 10大(대) 명산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명에 바닷가를 뜻하는 ‘浦(포)’란 글자가 들어간 곳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아름다운 리아스式(식) 해안이 섬 주변을 두르고 있다. 면적은 제주도의 4분의 1이지만, 해안선은 386.6km로 제주도(253km)보다 길다. 자연관광자원과 함께 포로수용소유적지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 해금강테마박물관, 거제자연예술랜드 등 역사문화 유적지를 건설해 관광산업도시로의 요건을 고루 갖추게 됐다.
현재 연간 관광객 수는 500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관광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2011년까지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새로운 휴양시설을 건설 중이다. ‘씨펠리스 호텔’ 준공, ‘대명콘도’ 착공, ‘메이페어 리조트’ 유치, ‘지세포 마리나’ 시설 유치 등 대형 휴양레저 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관광도시’ 거제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
거제도와 부산의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건설은 거제시 관광의 정점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2월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는 총 길이 8.2km에 사업비 2조2300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2시간30분이 걸리는 부산-거제 간 육상교통 소요시간은 거가대교 완공 후 약 40분으로 단축된다.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유봉도 거제시청 공보계장은 “2008년 경남 관광 실태조사에서 거제시의 ‘외도 보타니아’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각각 경남 방문지 1~2위로 꼽혔다”면서 “거제시의 관광 경쟁력의 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강조했다.
기간산업과 관광, 그리고 전통과 역사를 조화롭게 성장시킨 거제시는 선진도시의 발전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산업으로 소득 3만 달러를 이뤘고, 관광산업으로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거제시의 미래가 기대된다.★
“대한민국을 크게(巨) 구하겠다(濟)”

“巨濟(거제)를 한자로 풀이하면 ‘크게(巨) 구한다(濟)’는 뜻입니다. 壬辰倭亂(임진왜란) 때 李舜臣(이순신) 장군이 첫 승을 올린 옥포대첩의 현장이 바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옥포 앞바다입니다. 첫 승이 없었다면 당연히 ‘23전23승’도 없었겠죠. 6·25 때는 흥남철수 등으로 내려온 피란민을 통해 또 한 번 나라를 구했습니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지금 다시 한 번 거제가 나라를 구할 차례”라면서 “10년 전 IMF 때 조선산업이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듯이, 이번 금융위기도 조선산업의 부흥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닥친 위기라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거제 분위기도 당연히 좋은 편이 아니죠. 조선소의 신규 수주가 뚝 떨어져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 3년치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 데다, 2010년부터 경제가 회복된다면, 호황기 직전의 평년치 물량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산업 회복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삼성과 대우 모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가 없죠. 다만 기업용지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였는데, 지금은 ‘조선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이 찾아오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담당 공무원이 먼저 현장에 나가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관광산업 분야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워터프런트 시티’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착공되는 것을 비롯해 ‘거제해양특구’ 추진, 휴양형 리조트와 골프장 개발 등 민자 사업자를 통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와 부산을 40분 거리로 바꿀 거가대교가 2010년 12월 개통되고, 거제와 마산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2011년 착공합니다. ‘四通八達(사통팔달)’, ‘남해안의 허브(hub)’ 거제가 소득 4만 달러와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여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인터뷰] 姜萬洙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3만 달러 달성, 다른 나라보다 오래 걸릴 수도”
⊙ “거품 없는 실질적 경제성장 이뤄야 진정한 선진국 도약 가능”
⊙ “내수기반 확충,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 경제역량 확대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姜萬洙
⊙ 1945년 경남 합천 출생.
⊙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재무부 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역임,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1인당 GDP 4만 달러’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大選(대선) 당시 내놓은 ‘747공약’에서 처음 거론됐다. 연 7%대의 경제성장률, 2017년까지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10년 내 7大(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747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하는 姜萬洙(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하 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입안했다. 현재 이 공약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만수 특보에게 747공약의 입안 배경과 1인당 GDP 4만 달러가 갖는 의미,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747공약을 구상한 배경은 뭡니까.
“비전은 능력의 120%를 발휘했을 때 달성 가능한 목표이자 꿈입니다. 지금은 국가 비전이 ‘선진 일류국가’로 바뀌었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이었습니다. 당초 구상한 공약은 ‘747’이 아니라 ‘7대 强國(강국)’이었죠. 7%의 성장으로 4만 달러의 소득을 달성하고 7대 강국이 되자는 것이었지요.
세계경제 7위인 이탈리아를 제치고 ‘7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 7%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10년 후 4만 달러 국민소득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세계경제 7위인 축구강국 이탈리아를 꺾고 4강까지 올랐던 것이 모티브였습니다.”
―공약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까.
“IMF가 2005년 GDP를 기준으로 10大(대) 경제대국을 발표할 때 한국을 10위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렸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앞서 7위가 이탈리아, 8위가 캐나다, 그리고 9위가 스페인이었어요. 남북통일이 되면 인구규모로 볼 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제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대 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을 경제학 교수들과 민간연구소와 함께 검증했어요. 15개 경제대국의 10년 경제전망을 보도한 경제잡지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2006년 12월호, 당시 10년을 전망한 것은 이 잡지가 유일했다)를 근거로, 우리가 7%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10년 후 이탈리아와 근소한 차이로 7대 강국이 되고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747=선진 일류국가
―경제성장률 7%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까.
“당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4%대였는데, 규제개혁을 통해 1%포인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1%포인트, 불법시위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통해 1%포인트 성장을 추가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국민소득 추계에 있어 대통령 임기 5년 후 2012년에는 3만 달러 소득이라 ‘737’이 되어야 하는데, 공약작업에 참여한 기업인이 ‘737보다는 비행기 이름에 747이 있어 747이 더 친숙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아 10년 후를 목표로 하여 ‘747’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하는 것과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요. 747공약은 꿈을 갖고 열심히 뛰어보자는 비전을 제시한 공약이었습니다.”
―현재 이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가 747공약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747’처럼 숫자로 표현하는 게 논란이 있어 ‘선진 일류국가’로 바뀐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국운융성의 기회로 삼아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만수 특보는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인 현 시점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라는 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최근 경제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올해 12위에서 9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했어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의 경제위기는 새로운 경제질서 태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세계 碩學(석학)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무역수지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겁니다. 당면한 위기극복을 넘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해요. ‘4만 달러’가 갖는 의미는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反기업 정서로 경쟁력 많이 잃어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성장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성장과 비슷한 궤적을 그린 독일은 13년, 일본은 14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1인당 GDP 2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세계경제는 버블(거품)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가계는 돈을 빌려 소비를 촉진했고, 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를 해 왔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2만 달러, 3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죠. 거품으로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거품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장을 할 때 보다 튼튼한 경제구조를 갖게 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우리의 1인당 GDP는 2007년 말 2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5년째 魔(마)의 2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10년 내에 2만 달러의 벽을 넘었어요. 우리가 2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1998~200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2%였으나 투자증가율은 4.3%에 불과했어요. 지난 정부의 反(반)기업적인 정책에 의해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 우리 경제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일본에 비해 3배나 과도하게 절상된 환율에 의해 전반적인 대외경쟁력을 잃은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정부 마지막 해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절상되면서 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경상수지를 적자로 만들어 2008년 위기관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에 부담만 됐습니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경제의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인당 GDP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해도 곧바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투자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외수출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수출 의존도를 20%대 이하로 낮춰야 해요. 우리의 평균 수출 비중이 35% 전후였는데 2008년에는 45%로 상승했어요. 미국·일본을 포함한 OECD 선진국은 수출 비중이 20%를 넘지 않아요. 중국은 3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미래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죠. 그런데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임금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입니다. 교육·의료·관광·여가·문화산업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꼽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방과 교육, 농업분야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한동안 지속될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분야에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토목사업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治水(치수)사업과 환경사업, 강변을 따라 조성될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해 관광·문화사업,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우리의 농업도 향후 최첨단 유망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아주 많아요. 일본은 농업을 의료·문화·관광·교육과 함께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출농기업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現(현)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푼다는 게 첫 번째이고,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과거 우리는 서비스산업을 소비산업·낭비산업·사치산업으로 봤습니다.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수입니다. 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술(酒)산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금융산업도 성장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 경제위기의 출발점이었던 미국發(발)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금융의 존재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이 독립적인 산업이라기보다, 생산의 매개체로서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해요. 우리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됩니다.”
―‘녹색성장’이 현 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이 개념은 새로운 개념의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녹색성장은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지요.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죠.”
―결국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교관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정치에서의 기적은 이스라엘이고 경제에서의 기적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발전 원동력은 교육열입니다. R&D에 대한 투자도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지요.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해요.”
―1인당 GDP가 1만, 2만, 3만, 4만 달러로 성장할 때 국민의 단계별 생활수준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최근 소득 이외 문화·여가·건강 등 다양한 척도로 국민생활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국민생활수준 상승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봐요. 소득이 올라가면 여가도 늘어나고 문화·건강생활 등 삶의 질도 향상될 겁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4만 달러대인 국가는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영국·미국 등입니다. 이들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서로 비교하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모델
―이명박 정부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전략은 무엇입니까.
“내수기반 확충,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 경제역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어요. 또 減稅(감세)·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대책을 확대하고 있고, R&D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미래성장동력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코리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역량도 강화하고 있어요. 아울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신뢰에 기초한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성장보다 분배, 그리고 서민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까.
“MB노믹스의 요체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에 입각한 따뜻한 시장경제’입니다. ‘실용’과 ‘따뜻함’은 ‘시장’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어요. 7대 경제원칙에도 ‘자율과 경쟁의 최대보장’과 동시에 ‘약자와 경쟁탈락자의 지원’이 들어 있어요. 강조점이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국정운영 방향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데 있습니다. 경쟁과 시장경제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면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소득과 복지수준이 적극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복지지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8.6% 늘렸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 정부 중 최고입니다.”
―4만 달러 달성을 위해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작은 나라이면서 강국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들고 싶군요. 네덜란드는 한때 세계 10대기업을 2개나 갖고 있었고, 스위스는 세계적인 톱 브랜드를 5개나 갖고 있고 소득도 6만5330달러(2008년 세계은행 기준)에 이릅니다. 우리 기업도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POSCO 등과 같은 세계적 강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7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質的 구조조정 필요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맡고 계시는데 GDP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왔어요. 2010년에는 우선적으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통운영 체계개선, 민원업무 간소화, 우편번호체계 개선 등 비효율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로런스 서머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세기적인 위기를 맞은 지금은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세계는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불확실성 속의 생존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GM이 파산하고 씨티뱅크가 흔들리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위기에서 살아남으면 세계적인 강자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겁니다. 기업들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개선, 임금구조의 합리화, 낭비구조의 개선 등 기업 내부의 ‘질적 구조조정’을 해야 해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구조조정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승기’를 잡았으나 이제 ‘승기’를 ‘승세’로 굳혀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4만 달러 시대의 정부와 행정
민간, 시장에 넘길 것은 모두 넘겨야
⊙ 정부부터 작아져야 한다. 정부가 큼으로써 오는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어
⊙ 전체부터 보고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部處들은 부분만 내세우기를 떡 먹듯이 한다
金光雄 서울대 명예교수
⊙ 1940년 서울 출생.
⊙ 배재고·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同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공공정책학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역임. 現 서울대 공공리더십 센터 상임고문.
2009년 11월 말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7000달러다. 2만 달러를 넘은 때도 있었다. 현재의 배가 되는 4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대개 정부가 주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4만 달러 달성까지는 기업과 더불어 정부의 몫이 매우 클 것이다. 그렇다면 4만 달러가 되었을 때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신기한 것 중의 하나가 수혜국이 원조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경쟁력이나 정부의 효율성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뚜렷하게 더 나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경영개발원(IMD) 같은 기관들이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9년 9월 현재 27위다. 2006년에 38위, 2007년에 31위에 비해 많이 올라갔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은 순위다. 그런데 이들 순위는 평가기관마다 달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19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 행정효율성은 47위(2007년)이고, 기업경영 효율성도 45위(2007년) 수준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제도(28→53), 인프라(15→17), 거시경제(4→11) 등 ‘기본요인’(16→23), ▲초등교육(26→27) 고등교육(12→16), 상품시장(22→36), 노동시장(41→84), 금융시장 성숙도(37→58) 등 ‘효율성 증진’(15→20) ▲기업활동 성숙도(16→21), 기업혁신(9→11) 등 ‘기업혁신·성숙도’(10→16) 등 3대 분야의 12개 세부 부문에서 시장규모(13→12)만 빼고는 순위가 모두 내려갔다. 특히 아직도 공공 부문의 부패지수는 180개국 중 39위(5.5점)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세계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은 꾸준하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하면서 내일로 나아가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는 점이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의 정부는 줄어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크다. 정부를 줄이는 일부터 하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부터 작아져야
정부가 작아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先進(선진) 국가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최소화되고 많은 것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국가라는 뜻이다.
한국은 아직도 公共(공공)재정 지출이 국민총생산 대비 37.9%이다. 정부가 OECD에 보고하기에는 28%라고 해서 작은 정부인 듯 강변하지만, 공기업 65개를 포함해 계산하면 적지 않은 비중이다.
전형적인 관료국가인 한국 정부가 4만 달러 시대에 어떻게 변신해야 하는가는 많은 논의가 따라야 한다. 정부가 큼으로써 오는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한다. 힘들게 번 돈이 아니니 예산을 마구 쓴다. 현란하게 보이면 문화적인 줄 알고 돈을 퍼붓는다. 아직도 정부 고위직들은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를 쓸데없이 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보면 기가 막힌다.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들의 정부 규모를 잠시 들여다보자. 현재 4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20개국이다. 실제로는 25개국이지만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정부의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다. 부처나 명칭도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갖추었다. 노르웨이 17개 부처, 스웨덴 16개 부처, 네덜란드 17개 부처, 덴마크 19개 부처, 룩셈부르크 19개 부처, 독일 14개 부처, 스위스 8개 부처, 캐나다 23개 부처, 그리고 미국 15개 부처이다.
일본은 행정개혁 후 부처 수를 11개로 줄였다. 내각부(경찰과 방위),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이 일본의 현 정부 편제다. 하지만 이런 정부 편제가 미래정부형 편제는 아니다.
다양한 부처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은 부처 수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필요한 일을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료국가는 부처 수를 줄이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정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처 수를 줄이는 일에 급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다시 부처가 늘어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앞으로는 정작 정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려서 없앨 조직은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관광・체육 같은 업무를 정부가 관장하는 선진국은 없다. 반면에 우리도 노동·고용과 연관된 이민과 노인 관련 부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식량과 에너지 등을 관장하는 부처는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미래형 정부 조직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문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부문이다. 미래는 복잡계(수많은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 과학과 융합학문 시대인데도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시 건만 하더라도 기업이나 대학 유치라는 것은 20세기적 발상이다. 미래융합학문의 중심에는 디지그노(Designo·심미안과 지혜)가 자리한다.
과거부터 학문의 세계는 기억의 축(역사), 이성의 축(철학), 상상의 축(시학)이 있었는데 미래에는 상상의 축이 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인문·디자인·디지털(Humanity Design Digital·HDD)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계하고 보다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노력의 반영인 것이다. 그게 디지그노다.
사람들은 NT, BT, IT 등은 강조하면서 RT의 중요성은 모른다. 관계기술(Relations Technology·RT)은 기초기술의 가치를 배가시킨다. 관계들을 엮어 승수효과(경제 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의 몇 배의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일본 게이오 대학이 후지사와 캠퍼스를 구축하면서 12명의 유능한 컴퓨터 전문가들부터 보낸 것을 하나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은 놀라운 속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公私(공사) 부문을 나누는 등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처럼 공공재는 제3 섹터에서 관리해야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러시>가 향후 30년에는 공공부문이 ‘소아마비’와 ‘공산당’ 등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 중의 하나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다.
미래에 정부 내지는 공공부문의 위상은 분명히 변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가 되면 정부는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지, 지금처럼 중심에 자리를 잡고 한껏 뽐내는 기관은 아닐 것이다.
지금 정부 모습을 몸에 비유해 표현하자면, 머리는 크고 손발 등 몸통은 작아 운신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심장은 튼튼해 잘 달리는데 머리가 모자라 의미 있는 일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 더욱이 체내 혈관에는 혈전이 잔뜩 껴 혈관이 막혀 건강하지 않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
계급의식이 차곡차곡 쌓여 계급 간, 부서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정부를 그대로 두어야 할까? 학문 쪽도 마찬가지여서 관료의식과 감정을 인지행정학이나 감정행정학의 이름으로 규명해 볼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無(무) 정부까지는 안되더라도 정부가 지금 같아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세상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미래정부는 지금 정부의 원리와 규칙대로 상정하면 안될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부조직이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 효율성을 기하는 길도 다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민간 시장에 떠넘길 것은 모두 다 넘겨야 한다. 그땐 자율과 자정 기능이 정부보다 시장과 NGO가 훨씬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관광과 체육 등을 말했지만, 산업부의 성격이 정부에 남을 이유가 없다. 대신 에너지 같은 것은 정부가 관장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는 길은 결국 관료들의 인식과 의식의 대전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온갖 경영기법을 동원해 자로 재고 또 재봤자 낭비를 줄이기는커녕 비효율이 눈덩이처럼 쌓인다. 患部(환부)를 방사선으로 지져서 될 일이 아니고, 도려내야 사람이고 정부고 살아남는다.★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
‘빠른 추격자’에서 ‘창의와 혁신 지향하는 리더’로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패러다임의 단층적 변화로 열리는 성장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 선진국들은 혁신과 창의에 기반한 그 ‘무엇’을 통해 인류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어
金柱亨 LG경제연구원장
⊙ 1955년 서울 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同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大 경제학 박사.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연구조정실장, LG투자증권 상무, LG 경영관리담당 부사장 역임.
2010년 중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대로 회복되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2만 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안팎의 환경 변화에 휘둘리는 현재의 취약한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추가적인 소득수준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대의 고소득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일은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과제가 될 것이다.
OECD의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30개 회원국 가운데 2008년 현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노르웨이·스위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16개국에 이른다. 일본과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3만 달러 중·후반대, 그리고 헝가리·체코·멕시코 등은 우리나라와 함께 1만~2만 달러대에서 중·하위군을 형성하고 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내로라하는 경제 엘리트국가들이 모여 있는 OECD 회원국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좀처럼 달성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20개 회원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가는 데 평균 9.6년이 걸렸다. 그중 소득 4만 달러 이상 5개국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턱을 넘는 데 평균 6년 남짓한 시일이 소요됐다. 우리 경제가 ‘성공한’ 선진국들의 평균 궤적을 따라 간다면 1인당 소득 3만 달러는 약 10년 후인 2020년 전후에, 4만 달러는 2020년대 후반 어느 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30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대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8만 달러대에 이르면서 미국에 이어 국민소득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남북한 통일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인구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30~40년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 그동안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와 제반 경제여건이나 성장의 궤적이 유사했던 일본과 독일의 경우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91년이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불황, 세계 최고의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시달리면서 무려 14년이 흐른 2005년에야 소득 3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
오랫동안 국토분단, 통일 문제 등과 씨름하면서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 등 제조업 수출주도의 성장패턴을 유지해 왔던 독일도 統獨(통독)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과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지출, 기업들의 해외탈출 러시 등으로 인해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OECD 평균보다 훨씬 긴 13년(1992~2005)을 기다려야 했다.
일본과 독일이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터널을 통과하는 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한국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새나 주변 여건들을 보면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를 향한 우리의 앞날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금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산업화와 해외 식민지 경영에 나서면서 수세기 전부터 國富(국부)를 쌓아 왔다. 일본만 해도 100여 년 전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단행했고 빠르게 서구 선진국들은 따라잡았다. 선진국들은 길게는 수백 년, 짧아도 100여 년 동안 정치·사회·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無形(무형)의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고통 속에서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나 축적된 자본 없이, 내수시장 아닌 수출시장에 의존해 단시일 내에 경제규모를 키워 왔다.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적 자산의 축적, 혹은 나름의 안정적인 정치·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았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립, 뿌리깊은 지역 갈등 등도 지속성장의 걸림돌이다.

한국의 가능성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脫(탈)이념, 무한경쟁의 글로벌화 흐름은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으로 성장해 온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글로벌화는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냈고,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국가적 DNA를 키워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한국 기업들이 선진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잠재력을 잘 보여준다.
산업혁명 이래 수백년을 이어온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그린경제(Green Economy) 시대로의 전환은 가치창출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서 성장기회의 단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지식과 정보, 기술에서 기존 선진국들이 걷어낼 사다리는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해도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느냐의 관건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패러다임의 단층적 변화로 열리는 성장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경제주체들의 역량을 제대로 결집시키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느냐가 장차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强小國(강소국) 네덜란드는 많은 역사가들이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초 자본주의 국가로 꼽는다. 16~17세기 당시 수도 암스테르담을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로 만들었고, 전일제 증권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운영했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 역시 기계, 화학, 제약, 자동차, 가전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단순히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가치나 가치창출 방식을 구현하고, 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선진국다움을 인정받은 나라들이다.
단순히 남들이 잘하는 것을 따라해서는 衣食住(의식주)를 해결한 평범한 나라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들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강국 대열에 올라설 수는 없다. 진정한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역사의 어느 시기에, 그리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부문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을 꿈꾼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정보지식화의 물결, 성장과 환경의 가치를 조화시킨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요국 간 공조와 협력 등 세 가지는 미래 인류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다. 우리가 반드시 도전하고 성공시켜야 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적 변화인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정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국가 브랜드 확보는 물론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보고 배울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 근면과 성실에 더해 열정과 몰입이 있어야 한다. 남보다 앞선 리더이길 절실히 원하고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고의 리더십’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 富(부)의 원천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생각과 공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정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리더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일, 바로 그것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의 주역
‘창조적 인재’가 답이다
⊙ 사우디 압둘라 국왕, 美 하버드大 보유기금과 맞먹는 200억 달러 기금 출연해 세계적 수준의
KAUST(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 설립
⊙ ‘두뇌전쟁’ 이끌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국가의 흥망성쇠 좌우
白聖基 포스텍 총장
⊙ 1949년 경기 수원 출생.
⊙ 경기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美 코넬대 재료공학 박사.
⊙ 美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연구원,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포항공대 포항가속기연구소장 역임,
現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200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KAUST(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 개교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불과 이틀간의 짧은 여정에도 필자가 받은 인상은 매우 강렬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개교 행사 예산만 1억 달러가 들었다는 KAUST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이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대학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이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설립한 석·박사 과정의 연구중심대학이다.
국왕이 국영 정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에 총 200억 달러의 기금(이는 미 하버드대 보유기금과 맞먹는 수준이다)을 출연해 설립했다. 현재 이학·공학분야 11개 학과를 개설하고 2020년까지 교수 250명, 학생 2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설립취지는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지구온난화의 主犯(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유경제가 유발한 기후 변화의 인류문제를 해결하고자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석유경제 이후를 내다본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임이 분명해 보인다.
지식산업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에서 나오고, 특히 과학기술이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KAUST의 개교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세계 각국은 앞다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공계 대학을 집중 육성해 국가 미래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계는 지금 치열한 ‘두뇌전쟁’ 중이다. 과학 선진국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앞다퉈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의 위상 회복’이란 기치를 내걸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추경예산에 미국과학재단과 미국국립보건원 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일본은 2007년 과학분야 노벨상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초과학강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기초과학 역량 강화 전략 수립과 과감한 재정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기초과학에 뿌리를 둔 창조형 국가 건설을 위해 기초원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초과학 육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탄탄한 기초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학이 주도하는 新산업 창출해야

그러나 기초과학 연구 역량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재정적 투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선진국 수준의 창의적인 人的(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2009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년 전인 2005년 수준으로 퇴보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 250달러에서 고속성장을 해 10년 만인 1980년에는 1000달러를 돌파했다. 건국 40년 만인 1988년에 3000달러를 넘어섰고, 1994년에 1만 달러, 2007년에 2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만 달러 시대를 전망하고 있고, 또 이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수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총체적 의미의 선진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을 창출하고, 우수인재 한 명이 1만~10만 명을 먹여살리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의 체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은 인력과 자본, 토지를 바탕으로 한 양적 생산력 확대의 굴뚝형 산업 중심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남다른 역동성과 세계 경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모방과 양적 투입에 기반한 굴뚝형 산업구조는 더 이상의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고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후발공업국들의 부상과 도전으로 위기적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저변 확대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과학이 주도하는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21세기의 산업혁신은 과학이 주도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한경쟁시대인 것이다.
삼성전자+포스코<구글
최근 창립 4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나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40여 년 역사의 이 둘을 합친 것보다 1998년 창업하여 불과 11년 남짓 된 구글이 더 큰 기업 가치를 일구어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스탠퍼드대 두 대학원생의 흥미와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만 명을 먹여살리는 초거대 글로벌기업을 만들어 낸 것이다.
각종 재화의 생산력 확대를 통한 양적 팽창으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이 주도하는 신산업을 어떻게 형성하고 창출하느냐가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지식은 창의성에 기초한 무한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신산업 창출은 창의적인 연구를 권장하고, 이를 선도 육성하는 사회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또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정비와 정책들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
따라서 세계 기술혁신을 선도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신기술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원천기술은 기초과학 기반이 탄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21세기의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것과 병행해 현재의 주력산업들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질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대학 연구실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가 선진국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업 창출이 가능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를 활성화할 시스템의 미비로 기껏해야 지식재산권 출연에 그칠 뿐 연구실 내에서 사장되고 만다.
창업에 의해 수반되는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지원책을 늘려주는 정책이 확립되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선진화를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우수한 人的자원이 우리 미래의 자산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의 관건은 원천기술 개발을 주도해 나갈 창조적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결국 교육 문제로 귀결된다. 고도의 지식 창출과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대학이 책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공교육을 믿지 못한 채 소위 일류대학 입학에만 급급하여 사교육시장만 기형적으로 팽창해져 있고, 급기야 해외 유학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인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대학이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과학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적자원만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무역 통한 4만 달러 작전
중소기업 수출비중 확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 수출 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미국·독일 등이 6년, 일본이 12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불과 2년 만에 달성
⊙ 수출에서 3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비중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吳永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1952년 서울 출생.
⊙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美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희대 경제학 박사.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차관보·자원정책실장,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산업자원부 제1차관 역임.
2008년 이맘때 세계경제는 마치 지옥문을 마주한 듯 위태로웠다. 미국發(발) 금융위기가 거대한 불황의 쓰나미가 되어 全(전) 세계를 덮치면서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不況(불황)의 제단에 먹잇감으로 바쳐지는 신세가 됐다.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미국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망가진 경제가 회복되길 희망했지만 지지부진한 그의 지지율만큼이나 거대한 몸집을 일으키는 데 뜸을 들이고 있다.
노쇠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반 세기 이상 계속되어 온 자민당 1당 지배체제에 종언을 고한 일본 국민들은 10년 불황의 그늘을 떨쳐버리기는커녕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디플레 공식 선언’이란 저주의 축문을 들어야 했다.
서광은 다른 곳으로부터 비쳐 들기 시작했다. 브릭스(BRIC’s)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과 인도는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 각각 8.5%와 5.4%의 높은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성장률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2009년 성적표는 별로지만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최소 7년간 삼바 춤을 출 태세다. 러시아는 푸틴 총리가 2012년 大選(대선) 출마를 고려할 만큼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지형을 크게 뒤흔들면서 국가간 서열도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세상을 나눠 가질 만큼 커졌고, 음지의 거대국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남태평양의 대륙국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출구전략을 쓸 정도로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 중이며, 남미의 강자 브라질은 본격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 나서기 위해 워밍업에 돌입했다.
‘소득 4만 달러’를 향한 출발점은 수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시계는 확보되어 있는가?
연초 -2% 안팎이던 한국경제의 2009년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0%대를 넘어 소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10년은 4%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09년 세계 수출순위가 역사상 처음으로 9위에 오르고, 세계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로 커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 달러 대에 진입했지만 곧바로 다시 1만 달러대로 내려앉았다. 2009년에도 1만7100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995년 1만1432달러로 1만 달러 대에 들어선 이래 14년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다.
2만 달러는커녕 1만 달러 트랩에 갇힌 한국경제가 ‘4만 달러 소득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한 것은 ‘소득 4만 달러’가 단순한 계획이나 어설픈 방략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험난한 관문이란 점이다.
2008년 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위스·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쿠웨이트·캐나다·호주·아이슬란드 등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은 하나같이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이 국가들 가운에 인구 5000만명이 넘은 미국과 영국은 수출보다는 內需(내수) 확대를, 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인구 1000만〜5000만명인 국가들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도모했다. 반면, 일본은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4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국내경기 부진으로 다시 4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소득 4만 달러’ 진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우리에게는 수출이 있다. 우리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지 42년 만에 3000억 달러를, 다시 2년 뒤 40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수출 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데 미국·독일 등이 6년, 일본이 12년 걸렸던 것을 불과 2년 만에 해냈다.
2009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출순위 9위권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교역액 1조 달러 시대’도 멀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부존자원의 불리함과 수출성공의 노하우를 감안해 ‘무역강국’을 향한 치밀한 계획을 일사불란하게 작동시킨다면 ‘소득 4만 달러 시대’도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시급한 내수 확충작업
우선, 수출에서 3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 수출이 늘어나면 일본산 부품·소재의 수입 증가로 對日(대일) 무역적자가 자동 확대되는 惡(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비중 확대와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은 ‘수출호조-투자증대-고용증가-소비증대’의 善(선)순환이 안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산업이 자리를 잡는다면 수출증대는 곧바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매출, 고용 증대와 내수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부활시킬 수 있다.
시장적 관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중국 내수시장,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되 중소기업을 동반하는 전략이 유효한 인도시장,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42%로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아세안 시장을 주목할 만하다.
수출확대와 함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무역 불균형 해소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임을 상기할 때 重商主義的(중상주의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는 우리의 또 다른 과제다.
이런 점에서 내수확충 작업이 시급한데, 해결의 단초는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보건의료·교육·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교역재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推動力(추동력)은 주력 산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신제품 개발, 해외 인수·합병(M&A),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인재양성 같은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이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성장 프런티어 확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高(고)유가로 대표되는 에너지 문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표되는 지구 온난화, 물 부족과 환경오염, 低(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인류 비즈니스’가 그것이다.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철강·조선·석유화학·자동차는 高(고)에너지 소비구조를 초래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성장 엔진이던 에너지 多(다)소비형 산업을 에너지 低(저)소비형 산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무늬만 녹색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력 산업을 IT(정보기술)·NT(나노테크)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융합해 후발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에너지 고효율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으로 창출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 개발에 핵심 역량을 투입하고,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급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녹색기술의 발전·확산 과정에서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 오·폐수 처리 및 중금속 회수와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해 이들을 산업화하고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신속한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 문제는 지식과 정보산업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동시에 해외인력의 적극 유입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고령인구 증가를 헬스케어 서비스나 실버산업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호기로 활용함직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와 서비스를 단절적으로 인식하는 벽을 허물고, 헬스나 의료를 하나의 시스템 산업으로 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무역협회는 2009년 11월 30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10년 주요 공략시장으로 인도·아세안을 지목하고 진출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관광, 컨설팅, 전시컨벤션 등 주요 서비스산업 수출전략도 준비했다.
이에 앞서 2009년 4월에는 중국 내수시장과 일본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을 다짐했고, 이후 착실한 실행으로 對(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對日(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國富, 國格 그리고 國法질서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가 발전의 걸림돌
⊙ 법질서만 잘 지켜도 국내총생산(GDP)의 1%(10조원)에 가까운 國富 창출 가능
李石淵 법제처장
⊙ 1954년 전북 정읍 출생.
⊙ 전북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 박사,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방문연구원
(Visiting scholar).
⊙ 제23회 행정고시·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법제처 사무관·법제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실련 사무총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헌법포럼 상임대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 공동대표, 제조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역임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세계사에 기록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지구상 最貧國(최빈국)에서 G20(주요 20개국) 회의 개최국이 될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공은 근면한 국민성과 높은 교육열, 효과적인 국가정책목표 수립과 강력한 추진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힘입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헌법을 頂點(정점)으로 하는 근대적 법제도를 갖추고 이를 국가경영의 기본 틀로 삼았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주의,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法治主義(법치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행복추구권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기본권 존중의 정신을 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이 制憲(제헌) 이래 채택한 시장경제질서(시장경제적 법치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고 질적으로도 고도화를 示顯(시현)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역할에 변동이 생기고 법제도도 자율과 경쟁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모습은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규제개혁이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정부에 의한 과도한 규제를 담은 법령들을 개정하는 노력들이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를 운영하는 관료집단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영향력 축소에 대한 우려감에서 수구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성에서 관료들을 능가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 결과 통계 수치가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의 성과가 체감되지 못하고 관료들에게 실속 있는 규제는 여전히 존속됐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적인 법제시스템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법질서 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한국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09년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한국은 전년도 134개국 중 13위였던 것이 6단계 하락하여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락의 주된 원인은 勞使(노사)관계의 비효율성, 정치불안과 더불어 정부규제 부담수준에서 오는 법령 遵守度(준수도)의 하락 등이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질서만 잘 지켜도 국민과 기업에 국내총생산(GDP)의 1%(10조원)에 가까운 비용부담, 즉 國富(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법제도가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임과 동시에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낮은 것은 준법의식이 미약해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 법령체계(이 경우 법령은 살인, 강도·절도, 사기·공갈 등 기초 형사법 관계 법령이 아닌 행정규제 관계 법령을 의미한다)가 지나치게 규제 간섭 위주로 되어 있어 민간의 創意(창의)와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 법제는 기본적으로 금지나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해제나 허용을 예외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턴(U-turn)이 허용되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는 지역만을 표시하여 허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이나 토지규제 등 각종 법령에서 열거되는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우선 폐지하거나 규정 삭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존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편의를 전제로 한 事前的(사전적) 규제 방식인 인·허가 제도를 개폐하여 가급적 자유롭게 영업이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정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도와준다면서 간섭·규제 위주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나 행정만능주의 풍토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보건·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와 법적 대응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헌법 정신의 내실화라는 차원에서 권리보장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윌리엄 더글러스 美(미) 연방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의 보장 등 사회적 기본권은 확충돼야 한다. 또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도 법령에 주어진 역할이다.
우리 헌법은 그 前文(전문)과 기본권 조항에서 국민 생활의 상향적 조정(상향식 평준화)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를 배려하려면 경제가 활력을 찾고 國富(국부)가 축적되어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정부 들어, 법제처는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以法爲人·이법위인)’라는 기조 아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기업과 영업활동을 제약하거나 지장을 주는 법령,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개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행복법령 창출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법적 토대를 다져 나갈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선도하기 위한 법치주의가 완성되려면, 국민의 불편을 덜고 지키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단 시행된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제재(처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1) 법은 투명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법은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법의 적용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 경제 등의 현안과 사회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와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해결돼야 한다. 목표의 정당성에 앞서 법치주의의 생명인 적법절차가 존중돼야 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는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恣意(자의)에 지나지 않는다.
國格(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반영하는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部處(부처) 간의 이해다툼을 해결하지 못해 중요한 법령이 적기에 입법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조항 하나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령이 국무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는 부처 이기주의는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 각부 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에는 정치권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란 것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상임위 중심주의가 부처 이기주의와 결탁하여 청부입법이 벌어지는 사태도 추방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제도를 활용하여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회 다수당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 법제화시켜 나가야 한다.
법제를 포함한 국가 선진화는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진정한 國富(국부)를 이루는 길은 국가만이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국민의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부의 偏在(편재)도 경계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기초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부를 축적하면서 국격을 갖추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一流(일류) 국가가 되지 못한다. 법제의 재정비와 법치 원칙의 확립을 통한 선진적 국가시스템은 사회통합과 소통을 이루는 첩경이다.★
대학이 길러내야 할 4만 달러 시대의 인재
신지애, 코코 샤넬型 인재가 필요하다
⊙ 창의적 인재양성 위해 通涉 또는 학제 간 교육이 필수적
⊙ 과거에는 우직하고 성실한 인재가 최고였으나 새로운 시대에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
金漢中 연세대 총장
⊙ 1948년 서울 출생.
⊙ 대광고, 연세대 의대 졸업. 同 대학원 보건학 석사, 서울대 보건학 박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大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 의대 교수, 한국보건행정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통령자문 의료제도발전委
건강보험전문위원장 역임, 現 대한예방학회 이사장.
맹자가 취직을 하기 위해 양나라 혜왕을 만났다. 혜왕은 이 똑똑한 친구가 자기 나라에 와 준 것이 너무 기뻤다. 혜왕은 맹자의 손을 잡고, “그대가 몸소 不遠千里(불원천리)하고 달려와 주시니, 이제 이 나라에 어떤 利益(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맹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왕께서는 어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仁義(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때 이야기다. 나라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인재를 곁에 둬야 하는 절박한 사정은 채용하는 입장인 왕이 더했다. 그것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그런데 맹자는 이익 대신 인의를 말했다. 맹자는 과연 왕의 마음에 들어 채용됐을까?
요즈음 나라 간의 경쟁은 중국의 전국시대보다 더하다. 그러니 나라마다 인재를 구하느라 혈안이다. 인재를 기르는 핵심적인 기관이 대학이다 보니, 대학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길은 혜왕보다 절박하다. 이익이 되는 인재를 길러 달라는 것이다.
대학을 책임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 대학교의 교훈은 ‘진리·자유’다. 맹자 식으로 표현하면 인의에 가깝다. 그러나 이 교훈만으로는 혜왕 앞의 맹자가 되는 꼴이다. ‘진리·자유’ 밑에 ‘이익’이라 집어넣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세상의 어느 대학도 교훈에 ‘이익’을 집어넣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요즈음 말하는 實利(실리)라는 좀 더 점잖은 표현까지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익인가, 인의인가를 따지는 데서 좀 더 나가고 싶다. 이익이 중요한 세상이 요즘뿐이었겠는가마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이후 우리 사회가 가는 길은 이윤추구에 첨예화돼 있다.
누구도 이익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나는 이익에는 小利(소리)와 大利(대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리’는 자기 개인만의 이익이다. 개인을 둘러싼 좁은 범위, 이를테면 가족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조차 이루지 못하면 남의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니, ‘소리’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기본 행세를 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 ‘대리’는 개인의 범위를 넘어간다.
내일의 큰 세상을 만드는 인재

연세대에 재학 중인 신지애 선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50억원 이상을 벌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자 가난한 목회자였던 남편은 빚 탕감하고 남은 보험금 1700만원을 딸의 미래를 위해 바쳤다. 잘 알려진 신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다.
1700만원은 적은 돈이지만 50억원은 확실히 큰돈이다. 앞으로 신지애 선수의 상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는 눈앞의 ‘소리’가 아니라 먼훗날의 ‘대리’를 보았던 것이다. ‘대리’를 추구하면 돈의 규모도 커지지만 이를 수혜하는 범위 또한 한정 없이 넓어진다. 나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 나는 이런 인재를 키우고 싶다. 내일의 큰 세상을 만드는 인재 말이다. 지금 세상의 인재는 무엇이 바탕을 이루는가. 나는 그것을 創意(창의)로 본다.
그런데 창의적인 교육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1920년대에 이미 코코 샤넬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다.
그녀의 명성은 검은색을 패션에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블랙 드레스’가 성공하기 전까지 검은색은 죽음과 슬픔을 나타내는 색깔이었고, 하층민 이미지를 가진 색상이었다. 샤넬은 그녀만의 독특한 안목으로 검은색에서 아름다운 삶의 빛을 발견해 냈다. 그리고 실용성과 활동성 있는 의류에 검은색을 씀으로써 죽음과 슬픔의 색깔에 생명을 불어 넣었다. 세상을 거꾸로 본 것이다.
복수전공, 이중전공 기회 늘려야
그렇다면 오늘날의 창의는 무엇인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기르는 데는 通涉(통섭) 또는 학제 간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없이는 자칫 평범한 제너럴리스트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제 분야밖에 모르는 협소한 지식인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본다. ‘박사’의 한자어 博(박)은 넓다는 뜻이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狹士(협사)’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경우가 허다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unknown fact)을 밝혀내는 일은 그 학문 분야가 달라도 방법론은 같다. 그래서 박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박사가 되자면 먼저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거기서 나아가 새로운 대상과 소재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창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해야 할 미래 교육의 양상을 세 가지 방향에서 설명해 보자.
첫째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이다. 교육과정은 수시로 개편돼야 한다. 대학에서 배운 기술로 평생을 직장 생활하던 시대는 지났다. 통섭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전공, 이중전공의 기회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학생이 여러 전공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장벽을 낮춰야 한다. 지금은 필수과목 학점이 너무 높아, 다른 전공과 함께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이 영어를 비롯한 언어교육이다.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스위스를 예로 들어보자. 전 국민이 독일어와 프랑스어,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어로 강의를 진행했다. 언어 구사 능력을 토대로 우수한 학술 논문을 다양한 언어로 써서 발표했다. 그 결과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했는데, 그 기본은 언어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스위스와 비견한다면, 영어를 필두로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4만 달러 시대의 인재
둘째는, 치밀한 産學(산학)협력체제 구축이다. 한정된 연구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업체와 대학 사이의 원활한 산학협력 구조는 일정한 소득 외에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게 한다.
현재 산학협력에서 연구 진행을 위한 경제적 주체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대학은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산업체는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을 요구한다. 이것이 당장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원천기술 개발 및 연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은 ‘소리’다.
지식기반 경제구조에서 창조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위해 국가 및 대학 연구기관 주도의 중장기적인 선행 및 선도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 산업체 주도의 응용 기술이전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리’를 이룰 수 있다.
셋째는, 대학의 재정확보다. 국민들은 국내 대학들이 세계 일류대학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면서 외국 사립대학 등록금의 30% 수준인 등록금은 비싸다고 비난하고, 기부에는 인색하다.
20조원이 넘는 기금을 갖고 있는 하버드대는 기금 총액에서 부동의 세계 1위이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학에 기금 모금의 기회를 좀 더 넓혀 주고, 대학이 참여하는 수익사업 전개에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
‘소리’는 ‘小貪(소탐)’에 불과하지만 ‘대리’는 큰 꿈을 꾼다. 소탐이라도 있었기에 우리가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했다면, 큰 꿈이 있어야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4만 달러 시대는 큰 꿈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가 2만 달러 시대를 이룬 것은 이른바 굴뚝산업이라 불리는 제조업과 그에 따른 서비스업 덕분이었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탈출구로 인력 자원 창출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4만 달러를 바라보는 21세기의 경제는 다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한 고도의 글로벌화,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와 더불어 지식·의료·교육 같은 서비스 산업, 선도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지식기반 경제가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꿈꾸는 것도 인재요, 이루는 것도 인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한 가지 아쉬운 현상이 있다. 평준화의 추구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인데, 중·고교만이 아니라 대학까지 평준화 속에 가두려는 점이다.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월성의 추구다.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적응과 경쟁을 통해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한국은 아직도 하드웨어 중심,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젖어 인터넷 강국에서 모바일 후진국으로
전락
⊙ IT와 다른 산업의 결합 이끄는 ‘비즈엘리트’ 적극 육성하는 인프라 구축해야
田夏鎭
⊙ 1958년 서울 출생.
⊙ 서라벌고, 인하대 산업공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 美 스탠퍼드大 SEIT과정
수료.
⊙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네띠앙 대표이사,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INKE) 의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 역임.
⊙ 現 (주)픽셀플러스 사외이사, 인하대 겸임교수.

1998년, 우리나라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제 10여 년 남짓 흘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우리 일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터넷과 휴대전화에서 나타났다.
2008년 전 세계 인터넷 인구가 10억명을 넘어섰다. 1년간 경제규모가 600조원에 달하고 은행업무의 80%, 증권거래의 90%가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최대 통신회사였던 AT&T 자리를 대신해 구글이 나타났다. 두 번째 통신회사였던 월드콤이 사라지고 ‘이베이(eBay)’란 전자상거래 회사가 등장했다.
이제 인터넷은 무선통신망과 연결돼 모바일 인터넷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등 IT 기술의 종주국들과 함께 이 흐름을 주도하며 ‘IT 强國(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그 발달의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달콤했던 ‘IT 허니문’은 더 이상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터넷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의 경우 2009년 말까지 약 2억8000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2년엔 기존 휴대전화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2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작 1% 정도만이 아주 제한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3분기에 출시된 스마트폰의 수는 무려 4000만 대에 이른다. 삼성과 LG의 휴대전화시장 점유율은 이미 30%를 넘어섰지만 스마트폰은 아직 4%에 미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3G 서비스(3세대 이동통신기술 규격)를 시작했지만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후퇴는 과연 우리가 지식국가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플社(사)의 아이폰(iPhone)은 사용자 편의성(User Interface)이 타 제품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 그들은 각종 게임이나 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appstore.com)를 완전 개방, 전 세계 누구든 이곳에서 아이폰 관련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게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10만 개가 넘는 콘텐츠가 사용자를 기다리고 있고, 10억명의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했다. 하드웨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해 준 성공사례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통신업자들이 폐쇄적으로 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선택된 극히 제한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과거 저렴한 통신료 정책을 채택해 인터넷 강국이 됐지만, 현재는 비싼 통신료 탓에 모바일 후진국이 돼 가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아이러니다.
우리가 진정 4만 달러 선진국이 되겠다고 꿈꾸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세계를 압도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전과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용솟음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구축이다. 그렇게 얻어진 창조적 가치가 각종 산업에 접목돼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4만 달러 시대에 안착할 수 있다.
IT와 대리운전의 결합
도로를 넓히기 전에 스마트 신호체계를 도입해 차량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예산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 기술은 전국의 차량 흐름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솔루션으로 비싼 값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
산업사회의 성공이 땀 흘려 열심히 몸을 움직여 이룬 것이라면, 지식사회의 성공은 머리를 쥐어짜 내 얻어내는 성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머리 없는 몸은 이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터넷쇼핑은 이미 백화점 매출을 뛰어넘었다. IMF 시절보다 더 힘들다는 요즘에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덕분에 물류회사들의 성장도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는 오전에 책을 주문해 오후에 받아보는 시대가 됐다. 서점보다 저렴한 가격은 기본이다. 시간과 교통비 등까지 포함하면 그 절약의 폭은 더 커진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한국엔 이미 약 20만 개 정도 있다. 바로 대리운전이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대리운전은 제한된 지역에서의 영업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국에 20만명의 대리기사가 마치 나를 위해 대기하는 시스템처럼 운영되고 있다.
최근 DMB방송 광고의 대부분은 대리운전 광고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스마트’해진 대리운전 시스템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집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집 앞까지 모셔다 준다.
얼마 전 독일의 다임러社(사)는 올룸市(시)에서 ‘카투고(Car2go.com)’라는 新(신)개념의 차량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은 아무 곳에나 주차되어 있는 카투고 차량을 찾아 회원카드를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분당 4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아무 곳에나 주차해 두면 된다. 프랑스의 자전거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IT기반의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리운전 시스템은 향후 전 세계 도시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PC방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전 세계에 수출됐듯이 말이다.
비즈엘리트 적극 육성해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상당한 IT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IT 기술 기반 위에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안된다’고 아우성치는 산업은 IT가 접목되지 않은 산업사회의 분야들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세상의 물결을 타고 있는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 증대가 이뤄지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에 앞서 자신이 과연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 아닐까.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대비책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미래는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IT 기술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세련된 스마트 기술보다는 투박하지만 군중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쇼맨십을 더 필요로 하는 정치가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IT를 통해 세상이 변해 가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지식 창조국가가 되길 기원하는 지도자들이라면 겉치레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남들은 총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직도 활쏘기를 가르치면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선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연의 동력에서 기계의 동력으로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발명품을 갖게 되었듯이, 정보화 혁명은 인류가 단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다수와 다수 간의 시공을 초월한 소통방법을 선물할 것이다.
필자는 스스로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달인으로 성장하는 자들을 ‘비즈엘리트’라고 부른다. 비즈엘리트들은 주변을 배려하며 소통하고, 자신만의 경쟁력을 그들과 공유하며 집단지성을 이끄는 리더들이다. 우리 주변에 많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늘어나는 엘리트들이다.
이러한 비즈엘리트들을 적극 육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IT 기반의 기술 위에 창조적인 부가가치를 양산,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대가 필요하다. 창조력은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무대, 동기부여가 확실한 무대, 자신의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무대를 찾기 마련이다. 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쏟아낼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
그저 하드웨어만 덜렁 만들어 놓는다고 창조력이 용솟음칠 것이라 생각한다면, 산업사회를 못 벗어난 스스로의 고리타분함부터 질책해야 한다. 따라서 실패를 자산화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동기부여 정책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지식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식인프라다.★
경제자유도와 GDP의 상관관계
경제자유도 높여야 1인당 GDP도 높아져
⊙ 경제자유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은 고소득국은 73.2, 한국은 67.7
⊙ 인구 1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고소득국가의 평균 인구는 약 7400만명,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8000달러,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3배
趙東根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1953년 경기도 광주 출생.
⊙ 서울대 건축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美 신시내티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산업자원부 기술정책평가위원,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 現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고소득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다. 사진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중앙역 앞의 번화가.> |
경제학에 던져진 오랜 숙제는 경제의 ‘성공방정식’, 즉 무엇이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주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부존자원’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반드시 잘사는 것은 아니다. 풍부한 부존자원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부존자원의 逆說(역설)’이다.
新(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했다. 경제성장을 가져다준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성장요인의 기여를 定量化(정량화)한 것이다. 기술수준과 자본축적, 人的(인적)자본의 투입 정도가 성장률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자본축적을 꾀하고 교육투자를 늘려 인적자본의 質(질)을 높이라는 것이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은 명료해 보이지만, 실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라’는 식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내재된 유인과 동기를 간과하고, 경제성장을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좁게 봄으로써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 교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새롭게 조명했다. 노스 교수가 제도적 관점에서 영국 식민지와 스페인 식민지의 현재를 비교한 내용은 흥미롭다.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캐나다·호주의 생활수준은 스페인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 같은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노스 교수는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었는지 여부에서 찾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의 권력이 약했고 법치주의가 잘 지켜졌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자유의 폭이 넓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왕의 권력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리 없었다. 이 같은 제도적 차이가 식민지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과 같은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의 국민소득 倍增(배증)은 생산요소 투입 증가를 통한 ‘量的(양적) 성장’의 문제다. 이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어떻게 발휘하게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양적 성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다. 그러나 1인당 4만 달러 소득은 2만 달러 소득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質的(질적) 성장’을 꾀해야 한다.
高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비교
경제운영도 정부의 ‘보이는 손’이 아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중심이어야 한다. 이는 4만 달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식 정책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함을 시사한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철칙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시장整合的(정합적) 제도장치를 갖춰야 한다. 결국 4만 달러 소득달성의 관건은 ‘정책사고의 전환’과 ‘시장경제 시스템의 정비’로 압축될 수 있다.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을 위한 ‘전략’에 앞서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의 ‘조건’을 유추하는 것이 나름의 단서가 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가진 공통된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면 ‘조건’의 대리변수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참조했다.
2004년부터 2008년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을 선정해 이들 국가群(군)의 특성을 추출했다.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先(선)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가 ‘1000만명 이하’인 국가는 제외시켰다. 우리나라는 인구 면에서 중규모 국가이므로, 인구가 적은 高(고)소득국가와 수평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1>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고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호주·벨기에·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스페인·영국·미국·그리스 등 12개국이다. 그리스는 2008년에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2004~2008년간 3만 달러를 넘었다. 고소득국의 평균 인구는 약 7400만명으로 우리의 1.5배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8000달러로 우리의 두 배를 넘는다. 고소득국은 경제의 절대규모 면에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약 3배(인구 1.5배, 1인당 국민소득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국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각각 73.2와 67.7로 나타났다. 경제자유도는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가 허용됨을 의미한다. 경제자유도는 ‘하위 10개 지표’ 값을 계산해서 추계된다. 하위 10개 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하위지표 중 ‘정부지출규모’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그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아진다. 하지만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을 표시한 ‘정부지출규모’(하위지표 4번)는 그 값이 클수록 경제자유도를 떨어뜨린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부문의 자원사용 비중이 민간부문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자유도를 낮추게 된다.

한국경제의 취약점
<표1>을 보면 경제자유도 하위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노동보호 법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시장자유도’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매우 열위에 놓여 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反(반)부패지수도 고소득국에 크게 뒤져 있다.
‘금융산업의 국가소유 및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산업자유도’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자유도’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활동자유도’ 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기업활동자유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 면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및 조세부담률’을 나타내는 재정자유도는 우리나라가 ‘70.8’의 자유도를 가짐으로써 고소득국 평균 ‘59.1’보다 높다. 정부지출 규모도 우리나라(23.7)가 고소득국 평균(58.3)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는 2개의 하위지표(3번과 4번)에서 경제자유도를 더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개 하위지표에서의 이 같은 逆轉(역전)은 고소득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기인한다. 고소득국들은 사회보장지출을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밖에 없으며(재정자유도의 악화), 사회보장제도 운영은 방대한 정부지출(정부지출규모 증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고소득국이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 하위지표에서 낮은 경제자유도를 보이는 것은, 고소득국의 일반적 특성이기도 하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된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는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의 하위지표에서 고소득국에 비해 높은 ‘경제자유도’를 실현함으로써, ‘종합지표’로서의 경제자유도에서 그 차이를 줄이고 있다. <표1>에서 고소득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각각 73.2와 67.7로 나타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는 ‘하위지표’를 제외하고 경제자유도를 다시 추계하면, 고소득국과의 격차는 ‘73.2 대 67.7’보다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하위지표 3과 4를 제외한 8개의 하위지표는 “고소득국(선진국)에 이르게 하는 제도적 동인”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소득국에 이르는 길에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놓여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매우 안정적인 正(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경제자유도’(X축)와 ‘1인당 국민소득’(Y축)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2006년과 2008년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로서, 연도별 표본수는 176개국이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자유도를 全數(전수)조사하기 때문에, 176개국은 모든 국가를 포괄한 것이다. 2개년에 걸친 모든 국가의 정보가 축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림1>이 제시한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안정적인 양의 관계’를 ‘기각’(reject)할 수 없다.
<그림1>의 정책적 시사점은 간명하다. 1인당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적 시사’가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즉 경제자유도를 높인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1>에서 보듯이, ‘같은’ 경제자유도를 가진 국가라도 ‘상이한’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험적으로 두 변수 간에는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에 안정적인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려면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자유가 최대한 허용될 때, 시장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컨대 ‘반부패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낮아진다.
‘노동시장 자유도’가 높아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산업의 자유도’가 확보돼야 금융부문의 실물에 대한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희소한 금융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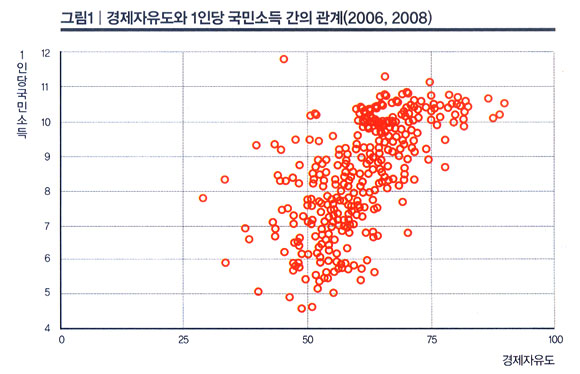
‘시장’이 답이다
경제자유도와 1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정자유도’와 ‘정부지출규모’의 국민소득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양자 간의 상관관계는 逆(역)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및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출규모’도 마찬가지다. GDP 대비 정부지출규모가 커서 고소득국이 된 것이 아니라, 고소득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상론할 겨를은 없지만 動態的(동태적)인 관점에서 ‘정부지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경제성장) 간에는 ‘負(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정부지출 확대는 민간 경제활동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4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노스 교수의 비판대로 ‘동의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면 개발연대식 정책사고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신성장동력이 선물로 주어질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성장동력은 경쟁이라는 ‘발견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찾아지며, 성장잠재력도 시장경제의 경쟁과 유인 체계에 의해 비로소 확충되기 때문이다.
4만 달러 국민소득은 결국 경제자유도를 제고시킴으로써 달성 가능해진다. “시장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지출 규모’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친화적 규제개혁도 종국적으로는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4만 달러 시대와 선진 신용사회
財테크보다 信테크가 앞서는 사회 만들어야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달성의 걸림돌 중 하나는 신용사회 확립의 문제
⊙ 2008년 9월 말 현재 한 가구당 빚은 4213만원,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은 1500만원에 육박
洪星杓 신용회복위원장
⊙ 1953년 충북 청원군 출생.
⊙ 성균관대 법학과, 同 경영대학원 세무관리 석사, 대전대 법학박사.
⊙ 서울보증보험 서울지역본부장·상무·전무, SG신용정보㈜ 대표,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역임.

30가구 남짓 오순도순 모여 사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무려 25가구가 파산했다. 이 영향으로 읍내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다. 어느 먼 나라로부터 들려온 해외토픽이 아니다. 바로 경남 남해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주민들에게 “빚을 안 갚게 해주겠다”며 개인파산 신청을 부추긴 결과다.
‘아직도 빚을 갚으십니까’라는 도발적인 내용의 광고와 현수막을 버스나 길 한복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 신용문화의 현주소다.
2010년 11월 G20 頂上(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G8을 넘어 명실상부하게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인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 한국경제가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국운상승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하는 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신용사회 확립이다. ‘신용’이라고 하면 신용카드 거래 같은 금융거래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빌린 돈을 잘 갚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등이다.
부채·파산공화국 오명 벗어야
신용은 경제와 금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로잡아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 원칙이자 행동강령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준수도 규칙을 지켜 다른 운전자나 보행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니 신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신용사회 확립의 걸림돌인 ‘부채공화국, 파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치유하는 것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인구가 600만명이나 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수는 2008년 2분기 현재 210만명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 브로커들의 회유가 그 원인 중 하나다.
무분별한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입는 손실만 지금까지 2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권과 성실한 금융거래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은 점차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은 본인은 면책받지만, 보증인은 변제의무가 유지, 추심이 가능해져 또 다른 파산자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
개인소비자의 과채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도 공통된 현상이다. 미국은 파산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높아져 2005년 개인파산 신청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연방도산법을 개정했다. 이듬해인 2006년에 미국의 파산 신청건수는 전년도의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도산법 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개인파산 신청자는 사전에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신용 및 재무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전 상담을 넘어 파산신청 전에 행정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들이 신용사회를 이룩한 것은 모두 시민들의 권리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지우는 제도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무부가 2008년 7월 개인회생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도덕적 해이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은행들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파산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중재기관의 사전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채무는 스스로 책임져야
과다채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증가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부채와 신용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경제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12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전체 가구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빚은 4213만원이며,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이 1500만원에 육박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빚이다. 집은 물론이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신용카드 할부 등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사는 이웃들이 부지기수다. 88만원 세대, 청년 백수 등 자조 섞인 용어로 미래가 걱정스러운 젊은이들도 명품을 선호하고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는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항상 붐비고 있다.
신용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신용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財(재)테크보다 信(신)테크가 앞선 사회가 선진 신용사회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신용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학생들도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자금 대출 변제계획을 세우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기 전에 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사회 전반의 신용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 없이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모든 금융행위가 신용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융행위가 知人(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것도 신용이 없다면 힘들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신용은 훌륭한 국가 경쟁력
언젠가부터 우리는 ‘독일인이 만들면 믿을 만하다’ ‘일본인은 약속을 잘 지킨다’ 식으로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독일인과 일본인은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상거래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두 나라가 戰後(전후)의 폐허 속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합류한 원동력이 됐다는 점이다. 개인과 사회의 신용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다.
영국의 옛 증권거래소 빌딩의 벽에는 ‘Dictum Meum Pactum’이라는 라틴어 세 단어가 새겨져 있다. ‘나의 말은 나의 문서’라는 뜻이다. 신용을 강조하는 이 말이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금융산업과 영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다.
우리 역사 속에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신용중시 문화와 전통이 있다. IMF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것이 신용을 최고의 商道(상도)로 삼았던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의 신용은 국내 상인은 물론 일본 상인들도 은행 이상으로 믿을 정도였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베니스 상인, 일본의 오사카 상인에 견줄 만한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 商人像(상인상)이자 정직하게 부를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부자像(상)이었다.
개성상인의 상도는 일부 우리 기업인들에게 남아 있지만 舊韓末(구한말), 일제 식민지,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점차 사라져갔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선진 신용사회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4만 달러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험이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도 있다. 선진 신용문화 구축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용사회 구축은 사회를 선진화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 달성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
문제는 소프트 파워의 확충이다
⊙ 집회 및 시위 발생 건수 미국의 3.5배,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 건수 일본의 44배
⊙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정도만 되어도 1인당 GDP 27% 증가
全相仁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1958년 대구 출생.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 사회학 석·박사.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환교수 역임.
⊙ 現 한국미래학회장.

| <신바람 나는 응원전으로 한국인의 단결력을 보여 주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광화문 모습.> |
대한민국이 언제 현재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워질 때가 있다.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그런 날이 과연 오기나 할까”라고 묻는 것이 보다 정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현재 우리의 자본 축적이 취약한 것은 아니다. 언필칭 세계 10위권의 경제大國(대국) 아닌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정보화 강국 아닌가. 인력과 인재의 측면에서 확연히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에다가 도처에 영재가 넘쳐나는 곳이 대한민국 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도약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無形(무형)의 형태임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그것은 정치와 사회, 문화영역 등에 걸쳐 있는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혹은 소프트웨어(software)를 의미한다.
경제발전은 결코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적 자원에 의해서만 가늠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경제적 조건하에서도 산출과 성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조직 차원에서도 그러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상기해 보라. 당시 전국 3만300여 행정 里洞(이・동)에 똑같은 양의 시멘트가 무상으로 지급됐지만 리더십과 마을 주민들의 상호협력 정도에 따라 지역발전의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나지 않았던가.
돌이켜보면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성공적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른바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 가운데 국가가 경제성장을 적극 주도한 경우도 드물었거니와 그것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는 더욱 더 흔치 않다.
사회자본의 확충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과 더불어 ‘계획국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근대 국민국가의 제도적 틀을 갖추자마자 농지개혁에 착수했으며, 문맹퇴치와 국민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나 국가주도 공공계획이 사라진 바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맞았고, 그것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진 측면도 없지 않다.
압축성장기 한국의 경험은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非(비)가시적, 혹은 비물질적 요소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GDP 4만 달러로 가는 시대를 여전히 국가가 선도할 수는 없다. 그것은 경제발전의 성숙화 과정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참여와 자율을 전제로 하는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양상이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무형의 요소 가운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일반적으로 규범, 신뢰, 협력, 참여 등을 포함한다. 사회자본은 사회통합을 직접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한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만약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정도만 되어도 1인당 GDP가 27% 증가한다는 예상도 나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2009). 신뢰 수준도 대체로 낮은 데다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55점 정도라면 대통령이나 사법부, 정부, 국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그것은 그 이하이며, 신뢰가 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영역은 내 가족이나 내 직장, 내 학교 등 ‘내집단(ingroup)’뿐이다(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07). 말하자면 사회적 총자본은 적고 분파적 사회자본만 풍성한 모습이다.
굳이 이런 수치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바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1950~60년대의 ‘헝그리 사회’(hungry society)로부터 벗어나는 대가로 최근에 들어와 미증유의 ‘앵그리 사회’(angry society)에 진입해 있다. 모두가 이른바 ‘루저’(loser) 의식에 사로잡힌 채 萬人(만인)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 발생 건수가 미국의 3.5배인 나라,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 건수가 일본의 44배에 이르는 나라, 청소년 다섯 명 가운데 하나가 감옥에서 10년 살더라도 10억원을 받게 된다면 부패를 저지르겠다고 대답하는 나라,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다니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지에 도달하는 경제적 기적을 기대하겠는가. 설령 그런 경제적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와 같은 현실의 진단이 아니라, 그것의 해결과 극복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증진과 사회자본의 확충에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도 보편적인 처방은 法治(법치)주의의 확립과 복지체제의 실현이다.
이 점에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의 법치적 기반은 허약하기 짝이 없고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도 허술하다. 선진국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거나 사회복지의 근간이 부실한 나라는 없다. 그것은 선진국의 기본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 위해 법치주의나 복지체제는 기본 요건이다. 여기에 추가해야 할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동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활력이다.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목표 달성에 자발적으로 매진하는 일종의 국민적 사기가 요구되는 것이다.
토머스 프리드먼에 의하면 세계화 시대에 애국의 무대는 일상의 생활공간이다. 과거처럼 전쟁터에서, 산업체에서, 교육현장에서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到處(도처)에서 無時(무시)로 일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프리드먼은 ‘집에서의 국가건설’이라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서구 사회에서 발원한 시민사회나 사회운동이 사회자본으로서의 사회 활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나 사회운동은 사회자본의 제도적 기초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공적 근대화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동력은 시민사회 개념이나 사회운동 이론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한국인의 강점은 ‘신바람’이었다. 배짱이 통하고 기분이 좋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목표에 헌신하는 태도가 한국사회 특유의 활력이자 저력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와 같은 활성적 사회자본이 우리 주변에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변모한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는 怒氣(노기)와 분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눔과 베풂에 익숙해야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자조적 표현이 말하듯 시민사회 조직은 사회적 활력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운동은 민주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일반 국민의 정서나 기대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이제는 ‘사회저변형 시민운동’을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거듭나야 한다. 누군가 멍석을 깔아주면 그 위에서 신바람 나게 일했던 과거 새마을 운동의 추억을 되살려도 좋을 것이다.
선진국 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조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선진국 사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계급과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회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에 부단히 성공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베풂과 나눔의 정신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봉건제를 거친 서구사회 특유의 역사적 전통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조선왕조 500년의 장수 비결을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의 전통적 지배계급 역시 베풂과 나눔의 일에 결코 나태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결코 인격이나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롭고 유리한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현대사에서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상류사회는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대단히 인색한 편이었다.
문제는 베풂과 나눔에 인색할 경우 언젠가는 가진 것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뺏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체제가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상류층은 먼저 많이 베풀고, 나머지 사회구성원은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나눔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선순환 구조다.★
선진국민이 갖춰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
투명성, 다양성, 시장 중시, 글로벌 마인드, 창의적 思考…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반부패 및 투명성 지수는 수년째 후진국 수준
⊙ 환승공항 장점 살려 공항 주변에 세계적인 패션 콘퍼런스 개최, 테마파크 건립,
카지노와 워터파크 운영, 경마장과 F1경기장 등 에어시티 개발해야
李采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1946년 경북 상주 출생.
⊙ 영남대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 국제무역학 석사.
⊙ 삼성물산 해외사업본부장, 삼성-GE 조인트벤처 대표, GE코리아 회장,
GE헬스케어 아시아 총괄사장, 한국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장 역임.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사람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이 소득 4만 달러에 걸맞게 선진화돼야 한다.
선진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의어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려면 투명성, 다양성, 시장 중시, 글로벌 마인드, 창의성 등이 일정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필자는 소득 4만 달러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을 얘기하기보다 4만 달러짜리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투명성’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치고 국가 운영과 기업경영에서 투명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은 나라가 없다. 개인과 조직의 부패와 상호 異見(이견)의 충돌,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은 해당 사회와 조직의 투명성 결여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反(반)부패 및 투명성 지수는 수년째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과 정부의 낮은 투명성과 부패를 꼽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명성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 선진화는 요원하다. 국가 차원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미룬다면 소득 4만 달러 진입은커녕 2만 달러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양성의 핵심은 종교, 인종, 국적 및 소득과 무관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다. 단일민족, 일사불란, 통일된 사고와 행동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믿음은 그 효용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다양성이 갖는 이점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
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조직이 선진국과 달리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양성의 수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반대로 글로벌 환경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조직들을 보면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국 중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한국의 경우 무엇보다 지도자 그룹의 人的(인적)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
우리 기업을 들여다보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기업 이사회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비슷한 배경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색다른 경험을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보다 그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대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한국의 主流(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의 특성(국적, 남자, 동문, 연령, 전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과 다른 경험이나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장 중시’다. 먹을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소득 4만 달러 진입의 본질적인 문제다. 먹을거리를 키우고 확보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간 보호무역주의는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며, 규제를 선호하는 국가와 사회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진화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시장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원칙을 정하고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글로벌 마인드’다. 이는 글로벌 관점에서 유연한 思考(사고)를 통해 함양할 수 있다. 우리 상품이 해외에 진출하면 좋은 일이고 해외 상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경계하는 심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균형을 잃은 생각이다. 이는 공존공영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해외고객(투자자·파트너·공급자)과의 상호이익 거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의 파이를 지키는 데 급급해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이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상호 입장을 존중하며 유연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은 ‘창의적 사고’다. 회의장에서 직위와 신분에 따라 좌석이 고정되어 있으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위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곳에 앉으면 생각이 유연해져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체면과 위신 앞세운 문화 극복해야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체면과 위신을 앞세운 문화가 잔존해 있다. 일전에 최고경영자 10명이 모여 중요한 협의를 하는 한 모임에 간 적이 있다. 현장에는 수행비서를 포함한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 20여 명은 모임에 참가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용 낭비였다.
國會(국회)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정감사장에 나가 보면 답변해야 할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수십 명, 수백 명이 대기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또한 시간 낭비요, 인력 낭비다.
이런 악습을 타파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 얼마 전에 어떤 고위인사가 입국한다기에 관례에 따라 공항사장으로서 영접하러 공항에 나간 적이 있다. 그때가 새벽 4시였는데, 출국장에 수십 명의 인사가 모여 있었다.
필자의 눈에 이들 대부분은 특별히 급한 업무 없이 그냥 눈도장 찍으러 나온 것처럼 보였다. 또한 어떤 고위인사는 말로는 거추장스러운 영접은 허례허식이고 배제해야 한다며 환・출영시 공항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면서는 정작 현장에서 취한 태도는 달랐다. 그는 자신을 에워싼 출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어! 아무개 국장은 안 보이네”라고 말해 무의식 중 불참자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
2009년 11월에 訪韓(방한)한 페루 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페루 대통령은 수행원 5명과 함께 일반석을 이용해 방한했고, 다음 방문국인 싱가포르를 향해 떠나갈 때도 역시 일반석이라 싱가포르항공사 측에서 이등석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일반적 행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됐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고부가가치 사업 창출’이다. 4만 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생각도 소득 수준에 걸맞아야 한다. 돈이 된다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택하고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항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운영서비스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런 평가를 기초로 공항운영의 노하우를 해외 주요 공항에 수출하는 컨설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의 한 사례다. 공항 주변에 마사지숍을 열어 돈을 벌어들이는 개발도상국 공항들의 서비스 형태와 차별화해야 한다. 단순한 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시술만 하는 동남아국가와는 다른 고급의료 분야로 승부해야 한다.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 달라져야
인천공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 2시간 비행거리에 중국과 일본이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5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는 환승공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여행객들이 自國(자국)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거쳐 유럽과 미주로 여행할 수 있는 환승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환승하는 동안 한국에 머물며 돈을 쓰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른바 에어시티 개발사업이다. 세계적인 패션 콘퍼런스 개최, 테마파크 건립 운영, 카지노와 워터파크 운영, 경마장과 F1경기장 운영 등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체류형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확대하는 데 인천공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짝 다가왔다. G20 개최 의장국이자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로서 2010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소득 4만 달러 시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우리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 행동과 문화를 비롯해 사업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4만 달러 전략, 마음이 부자되기
‘존경받는 부자’ 많이 나와야
⊙ 2만 달러 문턱의 한국은 ‘배고픈 부자’ 유형
⊙ 존경받는 부자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란 ‘남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수단’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
黃相旻
⊙ 1962년 경남 진해 출생.
⊙ 서울대 심리학과 졸업. 美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
⊙ 서울대 강사,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누는 삶이 일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할 김장을 담그는 자원봉사자들.> |
필자는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 우리가 잘살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어느덧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넘게 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000달러보다 10배나 더 되는 1만 달러를 넘자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다행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는 1만 달러 국민소득을 넘게 됐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다시 2만 달러를 부르짖으며 계속 더 잘사는 나라를 바라고 있다. 2만 달러 문턱에 있는 나라에서 4만 달러 국민소득을 기대하는 국가나 개인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국민소득 달러 숫자만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이 나라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부자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4만 달러 운운하는 국가전략은 猝富(졸부)의 삶을 그릴 뿐이다. 배고픈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잘살게 됐다고 하지만 결국 서로에 대해 배 아파 하는 나라가 된다.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풍요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삶과 정신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4만 달러 달성의 국가전략이 되어야 할 것 같다.
4만 달러 선진국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선진국 사람들이 가진 부자 심리, 즉 富(부)에 대한 마음이다.
우리가 가진 부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당함을 줄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헛된 욕심에 불과하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부자의 이미지를 파악해 본 결과 대다수 사람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부자의 코드는 ‘배고픈 부자’ ‘품격 부자’ ‘존경받는 부자’ 세 가지였다.
돈 자체가 목적인 ‘배고픈 부자’
부를 ‘성장’ 혹은 ‘부의 축적’ 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부자의 코드는 ‘배고픈 부자’다. 이는 누구나 부자가 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코드다. ‘배고픈 부자’는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보는 부자의 모습이자, 2만 달러 문턱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배고픈 부자는 현재는 돈을 버는 와중에 있고, 돈을 쓰는 것은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심리 상태에 있다. 일단 주변이나 사회를 고려하기보다 ‘나’ 를 중심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경제력, 투자, 재테크, 부동산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맥이나 투자감각을 중시한다.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 정보(지식)를 중시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 절제나 자기관리를 중시한다. 배고픈 부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들에게 번듯한 모습의 ‘빌딩’을 가지는 것이다.
‘배고픈 부자’ 코드는 어느 정도 부가 쌓여 있음에도 계속 부를 축적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 ‘돈은 곧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돈이 곧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부자들이다.
배고픈 부자 코드는 현재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 돈을 버는 데에만 열중한 나머지 계속 돈을 벌어야만 자신의 삶이 가치있는 것으로 여긴다. ‘4만 달러 국민소득’이라는 전략 속에 경제력과 투자, 재테크, 그리고 막연한 풍요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배고픈 부자’의 심리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고픈 부자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어떤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인가? 2만 달러 수준의 배고픈 부자가 지향하는 모습에는 ‘품격 부자’와 ‘존경받는 부자’가 있다.
품격 부자와 존경받는 부자
품격 부자의 모습은 자신이 축적한 돈을 쓰는 부자다. 이미 비교적 안정된 부를 형성한 사람이기에 이들은 자신의 부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의 格(격)을 높이려 한다. 2만 달러 국민소득 수준에 다다른 우리나라에서 國格(국격)이나 국가 경제력에 맞는 국가 브랜드나 이미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품격 부자의 코드로 국가의 부를 보기 때문이다.
품격 부자 코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란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다. 예를 들면 품격 부자는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장 등의 회원이 되려고 한다.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활동이다. 자신이 소수 회원을 위한 클럽의 멤버십을 가졌다는 것을 중시한다. 하지만 자선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리 품격 있는 일이 아니다.
품격 부자의 코드는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부자의 이미지다. ‘부자는 부자의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축적한 부에 맞는 품격을 중요시 생각한다.
이들에게 돈은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대상이다. 돈 자체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자신의 품위와 격조에 맞는 소비생활이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가정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가 이런 전문성을 얻을 수 있는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이들은 세상사를 현명하게 처리한다고 믿고 산다.
품격 부자와 다른 형태의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커다란 자선사업을 한 미국의 카네기나 경주 崔(최) 부자, 또는 故(고) 柳一韓(유일한) 박사 같은 사람을 연상한다.
하지만 존경받는 부자는 커다란 자선사업을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비교적 아낌없이 베푸는 부자의 이미지다. 부를 통한 자선행위나 사회적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존경받는 부자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 돈은 ‘남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수단’이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4만 달러 국민소득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에 많은 사람이 가지게 될 부자의 코드는 무엇일까? 2만 달러 시대인 현재 우리 사회는 다수의 ‘배고픈 부자’들이 품격 부자의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배고픈 부자들이 존경받는 부자로 변신하는 모습은 비교적 찾기 힘들다.
우리가 바라는 4만 달러 미래
국내 최고의 부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품격 부자의 코드를 잘 보여주지만, 자신의 부를 우리 사회의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많은 대기업이 公益(공익)사업 형태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은 배고픈 부자가 품격 부자의 格(격)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품격 부자가 존경받는 부자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생각하면 두 부자 유형은 공통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돈에 대한 두 유형의 인식을 살펴보면, 두 유형은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품격 부자는 돈을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존경받는 부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자체의 대상(혹은 수단)으로 돈을 바라본다. 품격 부자는 돈을 품위있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존경받는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잘 베푸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쪽은 ‘변화’ 보다 ‘유지와 관리’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변화’ 에 서 있는 형상이다.
배고픈 부자 코드를 가진 사람이 품격 부자에서 존경받는 부자로의 전환은 그리 쉽지 않다. 보통은 절제하는 모습으로 부를 이룬 사람이 배고픈 부자 코드에 머물지 않고 바로 존경받는 부자로 갈 뿐이다.
존경받는 부자는 우리가 4만 달러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았으면 하고 바라는 부자의 모습이다. 그들은 물질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롭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과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이런 유형의 부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누는 삶이 일상으로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4만 달러 국민소득에 걸맞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원조는 미래 위한 ‘행복한 투자’
⊙ 국민 1인당 원조 분담액 룩셈부르크 834달러, 노르웨이 826달러, 스웨덴과 덴마크는 500달러,
한국은 불과 16달러
⊙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원조를 제공해야
朴大元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 1947년 경북 포항 출생.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파리 국립행정대학원 수료, 알제리 피아레大 명예박사.
⊙ 駐프랑스 한국대사관 서기관, 駐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외무부 의전심의관, 駐알제리 대사,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2009년 5월 중국 네이멍구 쿠부치 사막에서 열린 나무심기사업에 참가했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부유층이나 지도층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말로, 로마 초기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유래됐다.
유래는 서양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훌륭한 사례가 있다. 영남지역에서 300년간 富(부)를 누린 경주 崔(최) 富者(부자) 가문이다. 많은 이가 최씨 가문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와 명예를 유지했던 비결이 독특한 家訓(가훈)에 있다고 말한다.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이 그것이다. 최씨 집안은 대대로 가훈을 실천하면서 흉년기에는 차용증서를 불태우고 저당으로 잡은 집문서는 되돌려 주었다. 이런 善行(선행)으로 조선 말기 동학농민전쟁 등 民亂(민란)을 당했을 때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나눔과 상생’의 원칙 아래 자신의 부를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데 활용한 최 부자 가문의 예를 오늘날 우리는 유럽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모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 달러를 넘은 나라들로 인구 5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부유하다. 이들은 그저 잘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가장 많이 돕는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스웨덴은 국민소득의 약 1%를, 다른 4개 국가도 0.8~0.9%에 이르는 금액을 公的(공적)개발원조(ODA)에 투입했다. ODA는 우리가 흔히 원조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을 말한다.
국민 1인당 원조 분담액으로 보면 룩셈부르크 834달러, 노르웨이 826달러에 달했고 스웨덴, 덴마크도 500달러를 넘어섰다.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하면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 국민은 개인적인 기부 외에 1년에 1인당 100만원, 스웨덴과 덴마크 국민들도 60만원 정도를 개발도상국에 원조로 기부한 셈이다.
원조는 장기적인 ‘투자’
이들 나라가 더 잘살기 때문에 더 많이 돕고 있는 것일까.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들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록하던 1996년에도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국민소득의 0.8~1%를 원조로 지원했다. 비율로 보면 현재와 다름없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소득수준의 변화에 관계없이 꾸준히 국민소득의 1% 가량을 해외원조에 지출하고 있다.
정권의 이념과 관계없이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조에 대해 덴마크 정부가 전략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지만,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원조를 自國(자국)의 國格(국격)과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투자’로 인식한 결과다.
북유럽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는 선진국들의 의무이며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장기적 관점의 국익을 염두에 둔 원조정책은 그 ‘순도’가 매우 높다.
2007년 기준으로 북유럽 3국의 아프리카 원조비율은 38%에 달하는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最貧國(최빈국) 위주로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공격적 ODA 투자’는 이들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강대국이 되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는 곧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가적 국익을 창출하고 있다.
2006년 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0대 기업에 유럽의 中小國(중소국)인 덴마크의 기업이 10개 社(사)나 포함됐다. 에릭슨, 사브(SAAB), 이케아(IKEA), ABB 등 우리에게 로고만으로도 신뢰감을 느끼게 해 주는 이들 기업들은 모두 스웨덴 기업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이미지가 자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가 이미지=기업 신뢰도
우리가 자랑하는 삼성이나 LG 등은 한국기업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보다 기업이나 제품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가브랜드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인색한 국가’라는 이미지 또한 브랜드 가치 평가에 적지 않게 반영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7년 국민소득 2만4000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당시 국민소득의 0.07%를 개발원조에 투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원조 분담규모는 16달러로 현재 환율로 2만원이 채 안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록하던 1996년에도 국민소득의 0.8~1%를 원조로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는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원조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했다.
우리는 경주 최 부자 가문의 정신적 유산을 과연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무역규모 세계 10위권’, ‘OECD 회원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등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개발원조 비율은 0.09%로 2007년에 비해 0.02%포인트 높아지기는 했지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0.3%의 3분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34%)나 네덜란드(0.8%)는 물론,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27%), 뉴질랜드(0.3%)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20년간 ‘ODA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OECD 국가 중 현재 4만 달러 이상 소득국에 진입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스와 포르투갈, 뉴질랜드는 1997년이나 2007년이나 국민소득 대비 원조 비율이 0.1%에서 0.2%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국가의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으며 단기간 내 3만 달러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해외원조를 많이 해서 국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나 부자나라가 되고 나서야 원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설명해 준다. 작은 부자는 개인의 절약과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의 뜻과 이웃의 마음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옛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다.
2009년에 D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선진원조국들에 현행 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발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원조 방안이 무엇인지 助言(조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원조의 양적, 질적 개선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갖는 우리의 독특한 장점을 잘 살린다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수출주도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이미지, 브랜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 우리 상품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품격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약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술과 산업이라는 하드파워(hard power)로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했다면, 4만 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세계 50개 나라 중 33위에 머물러 있어 세계 13위인 경제규모와 비교해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나 중국 등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하드파워 경제를 기반으로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이들 신흥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발전단계로 서둘러 진입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추진력은 소프트파워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존의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갖추게 될 경우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국민소득 국가가 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예견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활용하여 스마트파워를 갖추기 위해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사회적 발전과정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러한 기여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원조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선진국에 진입하자마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진정성을 갖고 개발도상국에 돌려주고 있는 나라’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4만 달러 시대의 지방행정
유비쿼터스化 행정으로 4만 달러 시대 견인
⊙ 민원은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 늑장행정은 뒷돈을 받는 행위보다 더 나빠
⊙ 행정은 서비스산업, 행정기관은 서비스 생산공장, 행정공무원은 서비스맨
柳和善 파주시장
⊙ 1948년 경기 파주 출생.
⊙ 양정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일본 히토쓰바시대 객원연구원.
⊙ 삼성전자 부장,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논설위원, 경기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한국경제TV 사장 역임.
골프 붐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골프를 치던 사람들은 얼마 후 클럽을 던져 버릴 것이다. 대신 사람들은 승마복을 입을 것이다. 3만 달러 시대의 모습은 그럴 것이다.
4만 달러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 화성의 전곡항에 가 보라. 수많은 요트가 넘실거릴 테니까.
과연 이뤄질 꿈인가. 물론 쉽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꿈꾸는 자에게 새벽은 밝아 온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행정은?
최근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 달러는 되어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민의 64%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다.
세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李明博(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대작전’을 계획하는 것은 일단 시의적절한 일이다.
문제는 ‘작전계획’이다. 환율효과에 무임승차하여 명목상의 4만 달러 선진국에 합류할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작전에 따른 새로운 엔진이 요구된다. 특히 행정에서의 엔진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현재의 추진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행정, 특히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행정은 생존행정이다. 4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이든 중앙행정이든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 많다.
이겨 본 사람이나 조직은 이기는 법을 안다. 그래서 또 이길 수 있다. 바로 승리의 善(선)순환 구조다. 선순환 구조는 변화와 경쟁을 통해서 얻는다. 그 때문에 변화를 읽고 경쟁을 즐겨야 한다.
익숙함에 빠지면 조직은 도태한다. 굳은살과 딱딱한 껍질은 보호막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자르고 걷어내고 고쳐서 구각을 깨야만 발전할 수 있다.
발, 땀, 눈물의 행정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서 있는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경쟁은 경쟁력을 북돋운다. 경쟁력은 능력의 시너지효과다.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
스포츠는 안방에 앉아서는 결코 할 수 없다. 행정도 이젠 책상물림이나 탁상공론 또는 펜대작업이 아니다.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을 해야 한다. 벤치마킹을 해야 하고, 아웃소싱을 찾아야 하고,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서야 한다. 경쟁이 바로 희망인 까닭이다.
경쟁은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경쟁의 장은 올림픽이다. 올림픽 경쟁에서 승리한 금메달은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인간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숙명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게 돼 있다. ‘본 투 윈(Born to Win)’이다. 따라서 경쟁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경쟁에 익숙해져야 한다. 경쟁을 즐겨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더 빨리 오게 하려면 적어도 그렇다.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시민주의 행정이다. 흔한 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시민주의 행정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시민만족 행정이다.
공무원은 생산과 판매하는 사람이고 시민은 고객이고 소비자다. 그래서 공무원은 ‘시민은 옳다. 시민은 항상 옳다’라는 단순함을 신앙해야 한다. 정답은 소비자인 시민 속에 있기 때문이다.
4만 달러 시대에 도달하기 위한 시민주의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민원행정이다. 시민의 소원을 지체없이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시민을 찾아가야 한다.
원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챙겨 주기도 해야 한다. 챙겨 주되 확실히 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선제적이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게 민원처리다. 왜 그런가?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다. 늑장행정은 뒷돈을 받는 행위보다 더 나쁠 수 있다.
행정은 곧 경영이고, 경영은 곧 이익창출이다. 행정의 손익분기점은 시민의 기쁨과 행복이다. 그 중심에 민원처리가 있다. 빠른 민원처리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민원처리 기간이 길다 보면 비리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주의 행정은 종합선물세트를 만드는 일이다. 미래의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까지 책임져야 한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인형을 원하면 초콜릿을 든 인형을 줘야 한다. 과자를 바라면 사탕과 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당근과 채찍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인센티브를 주되 페널티 또한 강화해야 한다.
행정은 서비스산업이고, 행정기관은 서비스 생산공장이며, 행정공무원은 서비스맨이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자조한다. 그러나 자조하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의 영혼은 서비스라고,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셀프(self)’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행정서비스는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 ‘요람에서 무덤까지’ 全(전) 생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人格(인격)이 있고, 도시에는 市格(시격)이 있고, 나라에는 國格(국격)이 있다. 행정은 시격이나 국격을 높이는 행위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일 수 있지만 萬人(만인)의 꿈은 현실이 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는 만인의 꿈이다. 그러나 그것이 賤民(천민)자본주의의 실현이어서는 안된다. 지갑만 두둑한 猝富(졸부)가 아니라 용모와 태도와 사고에서 모두 격조 높은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고품격은 청결과 질서와 안전과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도우미요 무수리요 상머슴이 돼야 한다. 쓸고 닦고 고치고 살펴야 한다. 파주시에는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전이 복지다’라는 슬로건이 거리 곳곳에 내걸려 있다. 깨끗한 환경에 깨끗한 공무원과 깨끗한 시민이 있다. 그러면 깨끗한 도시가 되고, 도시의 격이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품격은 브랜드 가치와 연결된다. 도시건 국가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브랜드가 명품이면 가격이 몇 배 비싸다. 물건의 격이 브랜드로 결정된다. 경영학의 원산지 효과는 브랜드 가치가 도시나 국가의 격과 직결됨을 말한다. 격을 올리려면 시민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행정이 그 몫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드와 단순함으로 승부

반응이 빠른 조직은 활기가 있다. 살아 있다는 증거다. 행정력은 스피드에서 나온다. 요즘의 스피드는 첨단정보 없이 불가능하다. 행정의 達人(달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남보다 빨리 하는 것이다. 빨리 하는 방법의 하나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들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항상 바쁘기만 하다. 우사인 볼트처럼 팬츠와 운동화만 착용하고 달려라. 그러나 그 운동화와 팬츠가 최첨단 제품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의 유비쿼터스화가 필요하다. 또 행정의 노마드(Nomad: 유목민)화도 요구된다. 유비쿼터스가 수직이라면 노마드는 수평이다. 원터치와 원포인트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단순함과 신속함으로 유목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4만 달러의 시대는 지금보다 복잡하다. 복잡할수록 빠르고 단순함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행정력은 스피드와 심플한 것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행정의 외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은 원칙과 상식이 어긋나지 않고 명분과 도리에 맞아야 한다. 법과 규정의 잣대가 사람과 때에 따라 고무줄 자가 되면 안된다. 그건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너무 원칙에만 매달리면 시민이 불편해진다. 불이익을 당할 사람도 있게 된다. 그래서 행정은 상식이 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명분과 도리는 大義(대의)와 이치에 관한 것이다. 명분은 전체에 이익이 되고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도리를 따라야 한다. 도리를 따르는 것은 이치에 맞고 경우에 밝아 無理(무리)함이 없는 걸 뜻한다. 그래야 행정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원칙과 상식에 맞으면 합법행정, 합리행정이 된다. 명분과 도리에 맞으면 투명행정, 윤리행정이 된다. 합법행정, 합리행정, 투명행정, 윤리행정은 행정의 4대 ‘기본강령’이다. 친구나 친척이나 고향을 잃더라도 할 수 없다. 행정은 이들 기본강령에 집착해야 한다. 4대 기본강령과 4만 달러 시대는 바늘과 실이다. 행복이라는 옷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4만 달러 시대의 문화예술 전략
예술이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끌어야
⊙ 교양, 오락과 예술에 관한 소비 지출 액수 1970년대 19달러에서 2005년에는 852달러로 상승
⊙ 소극적인 소비나 취미 단계를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여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될 것
朴一浩
⊙ 1959년 충남 부여 출생.
⊙ 서울대 미학과, 同 대학원 문학 석사, 철학 박사.
⊙ 충남대 조소과 교수, 제2대 대전시립미술관장, 제5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전시총감독,
현대미술학회 회장 역임.

| <국민소득이 늘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급증한다. 사진은 2012년 개관예정인 강북시립미술관 조감도.> |
2007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된 <모네전>(입장료 1만원)에 4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같은 시기에 서울시립미술관 옆에 있는 덕수궁미술관에서 전시된 <비엔나미술사전>(입장료 1만2000원)에도 27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 후 이어진 서울시립미술관의 <고흐전>(입장료 1만2000원)에는 70만명의 관람객이 들었다. 이쯤 되면 영화나 뮤지컬 공연에서만 말하던 블록버스터급의 예술행사라는 말이 미술전시에서도 통하게 됐다. 우리 대중의 문화예술 享受(향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예술행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을 설명할 때면 으레 “경제 발전의 영향”이란 말을 한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했고, 1990년대가 되면서 개인들의 삶의 질이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와 소비도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1993년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 달러에 진입했고, 2005년에는 2만 달러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교양, 오락과 예술에 관한 소비에 지출한 액수가 1970년대 19달러에서 2005년에는 852달러로 상승한 것을 그 예로 제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한다고 한다. 그 수준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몇 가지 사례가 제시된다. 우선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GDP가 높아지면, 문화예술에 대한 생산과 수요(소비)에 있어 양적 질적인 측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 생활시간에서 노동시간 대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반인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유형이나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끝으로 정부가 펼치는 문화 및 문화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의 성격과 양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년 후의 문화예술계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1인당 GDP 4만 달러를 이루게 될 때 문화예술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4만 달러의 의미는?
막연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 소득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수준과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대의 문화예술은 2020~2025년 사이의 우리 문화예술 수준을 가늠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 대략 15년 후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상상이 가능하다.
첫째, 예술창작의 측면이다. 어떤 미술작품들이 主流(주류) 미술로 등장할 것이며, 미술작품의 창작에 대한 여건들은 어떻게 변할까? 컴퓨터나 비디오 TV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미디어아트라 하는데, 그 분야는 여전히 유행할 것이다. 아니 가상현실이나 (감상자가 작품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성이란 점에서 지금보다 더 첨단의 효과를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나 첨단 기계가 더욱 발달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달성되는 효과들이 더욱더 다양하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술가들이 그 효과들을 다루고 예술작품으로 응용하는 기술도 발전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아시아 미술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바탕이 되면서 중국, 인도를 비롯한 한국 미술시장까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서 평가되고 진행되어 온 문화예술 현상들에 대한 반발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나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전시회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서구 미술의 수동적인 수용이라는 점에서보다는 그 비엔날레들이 담고 있는 한국적인 관점과 아시아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렇다. 따라서 각 나라나 지역의 특수성이 바탕이 된 세계화 국제화 및 소통이라는 방식이 미술창작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예술작품 직접 제작 경향 생겨날 것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을 대하는 관객(소비자)들의 태도 변화다. 소극적인 소비나 취미의 단계를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서 여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단순히 감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아마추어적인 단계일지라도 체험하고 예술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려는 경향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도 문화기관들에 의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문화와 예술이 가진 감성적인 측면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非(비)인간적인 측면들에 대한 반발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예술이 펼치는 상상력을 통한 세계와 유연한 접근 태도가 개인적·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지능지수보다는 감성지수에 주목하고, 명확하게 구분 짓고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보다, 통합적인 사유방식을 강조한다는 점과도 관련을 갖는다.
머지않아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술작품 실습과 창조적 표현을 강조하면서, 나아가 사회적·국가적으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들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 수준에서부터 지원 유형,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보다 체계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이 예상된다. 우선 국민의 문화예술 창조나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다.
2002년에서 2007년에 걸쳐 5년간 나타난 우리나라 미술관 및 문화기관 변화 통계에 의하면, 공공미술관은 9개에서 25개로, 사설미술관은 52개에서 87개로, 문예회관은 113개에서 161개로, 소규모 문화의 집은 123개에서 225개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년 후,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예술기관의 수는 적어도 지금의 두 배 정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할 때, 市(시), 郡(군), 區(구) 단위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공간에서 주민들의 문화체험과 창작 및 감상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 201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군기무사 터에 신축될 국립현대미술관 신관, 인천 대구 등 대도시에서 공사 중인 미술관들이 완공되어 제 구실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또는 그 지역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갈등 치유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해야
양적 증대에 못지않게 질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중요하다. 대다수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유형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多文化(다문화)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의 공급,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또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소득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문화 소외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공립 미술관과 각 지역의 학교 컴퓨터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전산망의 구축으로 학생들의 감성적 체험 교육을 위한 기반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문화공급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또 다른 국면으로 향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술과 문화가 우리 국민의 통합을 넘어 70~80여 년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점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때 필요한 문화의 새로운 통합력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
4만 달러 시대 진입 전략
‘新산업 창출’에서 4만 달러의 미래 찾아야
⊙ 미국·영국은 금융강국, 캐나다·호주는 자원강국, 일본·독일은 제조업 강국, 프랑스·이탈리아는
서비스업 강국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힘은 企業家 정신에서 나온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미래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정신이 필요
金峻漢 포스코경영연구소장(대표이사)
⊙ 1952년 경북 안동 출생.
⊙ 경북고·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 석·박사.
⊙ 국제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駐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 경제조사관, 산업연구원 총괄조정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역임.

2009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1만 달러를 넘은 이후 12년 만인 2007년에 2만 달러의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2008년 몰아닥친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 원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다시 1만 달러대로 후퇴했다.
전 세계에는 250여 개의 크고 작은 국가가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만 달러 소득을 넘는 국가는 대략 30개 정도, 비율로 따지면 12%다. 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17개 국가에 불과해 상위 7% 내에 드는 정도다. 수능성적으로 따지면 1~2등급 수준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수준 상승을 넘어 문화·의식·제도·노사관계 등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사회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4만 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우리 경제를 이루는 주축산업의 도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4만 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키포인트는 뭘까. 우선 OECD국가 중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추릴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14개 국가가 유럽 국가이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이 그들 국가이다.
또 대부분 국가가 小國(소국)경제(small economy)다. 인구 1000만명을 상회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뿐이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인구가 적게는 30만명부터 많아 봐야 900만명에 불과하다.
한편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기간, 즉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적으로 13년이었다. 제일 빨리 달성한 룩셈부르크는 7년이 걸렸고, 가장 늦게 달성한 핀란드가 18년이 소요됐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2007년에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때, 2020년에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 여건과 우리의 발전전략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다.
4만 달러 국가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차 산업 비중이 평균 28%인 데 비해 3차산업 비중은 70%에 달한다.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될 때 3차산업 비중이 64%에서 70%로 상승했다.
새로운 제조업 전략에서 열쇠 찾아야
3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들이다. 3차산업 비중이 57% 수준인 우리의 경우,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3차 산업의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 육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고, 정부도 서비스업 육성을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육성만이 해결책일까? 우선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만 달러 국가 중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위스 등은 3차 산업 비중이 6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현재 우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고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근접한 국가까지 포함해 보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들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미국·영국은 금융강국, 캐나다·호주는 자원강국, 일본·독일은 제조업 강국, 프랑스·이탈리아는 서비스업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별 펀더멘털과 경제규모에 따라 4만 달러 국민소득 달성 경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보다 빠른 길이다. 참고로 국내 지역별 생산통계에서 인당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대표적 지역은 울산, 거제, 포항 등 산업기반이 강한 도시들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이 성장동력을 우리의 기존 강점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의 선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선 ‘新(신)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과 2만 달러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기반은 제조업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규모나 경쟁력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위기 이후 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업은 일찍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1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반도체 1위, LCD TV 1위, 자동차 5위, 철강 5위 등 세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조업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業의 전환
그러나 다음 4만 달러 시대를 이끌기에는 기존의 제조업, 과거의 성공방식으로는 어렵다. 量的(양적)인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質的(질적)인 점프 업(jump-up)이 동반돼야 한다. 첨단기술, 새로운 아이디어가 덧붙여서 기존 제조업에 미래를 입히는 신제조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과거의 내연기관 중심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로 業(업)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조선산업도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深海(심해) 유전·가스 개발, 해상 풍력, 심해저 자원채굴 관련, 해양(off-shore) 플랜트 건설과 해양 공간을 이용한 레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철강산업도 환경규제의 강화, 고객 요구의 급변, 에너지와 원료의 제약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면서 친환경기술, 에너지 저감기술, 복합소재기술 등 산업간 융·복합기술의 빠른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제조업의 트렌드를 먼저 읽고 앞서서 대응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 미래 가치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주도적인 위치를 세계 속에서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다음은 10~20년 후 먹고살 미래산업, 즉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찾아 육성해야 한다. 미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그린산업, 신소재산업, 나노산업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래기술과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듀폰, GE, 인텔의 변신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래기술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산업의 기술표준과 사업 선점을 노리기 때문이다.
녹색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녹색산업 시장을 100조 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과 역량으로 이 모든 미래기술이나 산업을 다 할 수는 없다. 4만 달러 시대를 열기까지 우리가 가진 강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산업정책이 그래서 필요하다.
IT기반이 강하다면 IT를 활용하는 미래사업, 조선산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오션사업, 철강이 강하다면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사업구조 변신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 기업들은 기술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듀폰은 1970년대 1차 석유파동의 발생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새로운 화학제품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로 핵심사업을 확장했다. 이후 변화를 거듭해 오늘날의 듀폰은 화학신소재, 전자소재, 생명공학제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과학에 기반한 新(신)물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학회사(a science company)’를 지향하고 있다.
GE는 1980년대 초반 낮은 진입장벽과 외국 기업들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부엌용품, 헤어드라이어, 다리미 등 수익이 저조한 사업에서 철수하고 하이테크, 금융, 서비스 사업 등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했다.
인텔은 1980년대 초반 일본 전자회사들의 대거 진입에 대응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업에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 한 반면, 인텔은 모든 투자를 미래사업인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업에 집중했다.

글로벌 톱 기업 지금보다 3배 이상 되어야
경영학의 大家(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내일은 오늘과 다르다. 오늘 최강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곤경에 빠진다”고 했고,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기업에는 시장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과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미래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주력산업을 이끄는 실질적인 경제주체는 기업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주역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企業家(기업가)다. 우리가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세계 1위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글로벌 톱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포천>지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가 100위 내에 랭크돼 있다. 또 포스코, GS, 한국전력, 한화, 삼성생명, 한국가스공사, S-oil, 두산, 삼성물산이 500위 내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총 14개 기업이 포함돼 국가 순위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스위스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경기불황으로 많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500대 기업에 140개가 포함돼 여전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컨드 티어’(second tier)인 일본, 프랑스, 독일 수준에 이르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은 50개 내외의 글로벌 톱 기업을 양성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미래 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업가 정신과 함께 글로벌 톱 기업의 열쇠는 창조적인 인재 확보와 첨단기술 개발에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미래 기술과 제품에 대한 R&D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궁극적인 勝者(승자)는 결국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기존 기술이나 제품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이나 제품)을 가진 기업이 될 것이다.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이 있어야 4만 달러 시대를 넘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패스플로어’(Path Follower·추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개척자)가 돼야 한다. 4만 달러 진입의 요체는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4만 달러를 위한 시장경제 마인드
가수 박진영의 도전정신을 배워라
⊙ 경쟁을 받아들이고 규제를 풀어야
⊙ 인구의 30%만이 일류 제품을 만들어 내고, 나머지 70%는 이류 제품을 만든다
金正浩 자유기업원장
⊙ 1956년 서울 출생.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 現 자유기업원 원장, 한양대 디지털경제경영대 디지털경제학부 겸임교수, 성균관대 초빙교수.

미국·독일·프랑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 세상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들이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들처럼 된다는 말이다. 필자 세대가 어릴 적에 이들 국가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환상의 나라들이었다. 지금 우리는 그 환상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어릴 적 우리 세대가 꿈꾸던 ‘환상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우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려면 국민 각자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어야 비로소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최근세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의 소득을 높여 온 것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생산성 증가 덕분이다. 鄭周永(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 초 울산 조선소를 만들려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장을 찾아갔을 때 보여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던 거북선이었다. 그것 이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의 조선업은 황무지였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조선기업들은 全(전)세계 대형 선박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와 TV와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전자 산업 역시 세계 최고의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자동차 기업에서도 최고 수준의 차를 수십만 대씩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득을 2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우리의 제조업과 건설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손톱깎이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제조기업들은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 건설업 역시 그렇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한국의 건설업체들이며, 가장 어려운 공사를 해내는 것도 그들이다. 만약 한국의 모든 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처럼만 해낸다면 우리는 이미 4만 달러 또는 5만 달러의 소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경쟁을 받아들여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의 산업은 그렇지 못하다. 농업과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은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자녀들을 일찍부터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로 내보는 것은 우리의 교육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농민과 법조인들과 방송인들이 개방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자신들의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득 4만 달러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제조업과 건설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업과 공공부문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30% 안팎이다. 나머지 70%는 다른 일들에 종사하고 있다. 농사와 교육과 언론과 엔터테인먼트와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근로자들의 70%인 것이다. 인구의 30%만이 일류 제품을 만들어 내고, 나머지 70%는 이류 제품을 만드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 우리나라 전체가 일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교육과 의료와 방송과 법률서비스와 농업 모두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올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가능해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경쟁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국민 각자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이고, 국민 각자가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최소한 10여 년은 국제 경쟁으로 단련을 해야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가수이자 JYP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인 박진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준다. 그는 가수로서 한참 잘나가던 시절, 그 편안함을 내던지고 미국의 음악시장으로 진출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문전박대를 받아 가며 터를 닦았고, 이제 원더걸스를 데뷔시켜 빌보드 차트 76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성공했다. 아직 그 성과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 없이 부딪치는 자에게는 세계의 벽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우리의 안방으로 불러들이기도 해야 한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들어 낸 물건들을 그들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산업 분야이건 지난 50년 동안 보호받아 왔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사람과 제품을 우리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의 일부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규제도 풀자. 지역과 의료와 교육과 방송과 법률을 묶어 놓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정권마다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아직도 큰 규제들은 그대로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족쇄처럼 차고 있는 중요한 규제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고,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만 봐도 그렇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수도권의 발전을 철저히 묶어 놓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규제를 풀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실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선진 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과 시도는 늘 지방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표 잃는 것이 두려운 정치인들은 지방민들의 반사이익을 두둔해 왔다. 이제는 누군가 그 사슬을 과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육에서도 그렇다. 한국의 학교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학교와 교사들이 경쟁의 압력을 견뎌내야 한다. 외국 학교의 진출을 허용하고, 학교 운영에 자유를 준 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한국의 학교 중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학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매번 외쳐대는 것이 공교육에 대한 투자의 확대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늘린다고 교육의 질이 올라갈 리 없다.
교육뿐만 아니라, 법률과 방송과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보호받아 왔던 특권들을 포기해야 비로소 그 분야가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규제완화를 위한 국민의 태도변화와 정치인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노조의 이기주의 극복해야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소비자의 취향이 바뀔 때마다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데, 노조는 과거에 만들던 제품을 계속 만들겠다고 고집하기 일쑤다. 그래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 노조도 회사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노조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어느 기업도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
그와 더불어 근로윤리를 세워야 한다. 근로윤리 없는 복지국가는 망한다. 유럽의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실천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라는 것이 있다. 즉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늘이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태도이다.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법을 넘어선 시위군중이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고, 시위를 진압하다 발생한 사고 때문에 경찰청장이 물러나는 모습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범법자는 누가 되었던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풍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적인 국민들이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매진할 수 있을 때,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4만 달러로 가기 위한 국가재정 전략
예산낭비 막기 위한 성과평가제 도입해야
⊙ 국가 번영의 요체는 제도와 지식 훌륭한 제도와 지식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신
⊙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할
일이다
崔洸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 1947년 경남 남해 출생.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美메릴랜드대 경제학 박사.
⊙ 美와이오밍대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예산정책처장 역임. 現 한국외대 교수.
2003년까지만 해도 경제규모 세계 11위를 자랑하며 10대 경제강국 진입을 눈앞에 뒀던 한국경제가 5년 새 4단계나 하락, 2008년에는 15위를 기록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경제가 2010년에는 16위까지 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규모로 볼 때 한국은 세계 15위권이지만 1인당 GDP는 2만 달러로 세계 200여 나라 중 50위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는 왜 추락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한국경제는 각종 개혁을 빌미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심화되는 국제경쟁 속에 자신감을 잃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家計(가계)로 구성돼 있다.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기는커녕 문제의 원인 제공자다. 오늘날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가 전문가의 눈에도 너무 복잡해졌고 그 움직이는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논리를 앞세우는 관료와 정치가가 주체인 느림보 정부가 4차원의 공간 개념으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민간부문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 설치니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산도 아니다. 번영의 요체는 바로 ‘제도와 지식’이다. 훌륭한 제도와 지식의 핵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이다. 우리의 경우 反(반)자본주의적·반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반자유주의 정신이 풍미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의 혼동’을 지적한다. 효과성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ing the right thing)을, 효율성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을 뜻한다.
여기서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물론 최선의 경우는 가장 유효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유효하지 못한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드러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국가경영에 대입해 볼 때, 우리는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을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해치우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사업 중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어야 할 사업을 감행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는가.
애덤 스미스는 불후의 명저 <國富論>(국부론)에서 “국가가 빈곤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정부, 예측 가능한 법률, 부당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230년 전에 국가 번영의 요체를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을까?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보다는 “정부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또는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장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육·문화·예술·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시장논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품질이 높거나 가격이 저렴한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뿐이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것은 자원뿐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함께 소멸된다.

예산 성과 평가해야
재정질서는 국가가 기능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많은 조항은 9차에 걸친 改憲(개헌)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재정관련 조항들은 1948년 제정헌법 이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재정과 관련된 현행 헌법 규정들은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또 국가재정법 등 법률과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간부문 개입 최소화, 국민부담의 최소화 및 명확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공고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 시 재정에 관한 독자적 章(장)을 설치하고, 재정 실체의 규정 명문화, 헌법과 기본법의 역할 분담, 통합예산의 명시와 기금에 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의 마련, 세출법률주의, 세입법률주의, 재정·조세 전문 법원의 설치,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재편, 총량적 재정규율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정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 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 채무의 지속적 증대이다. 이는 재정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경제 전체의 활력 유지와 연결된다.
재정을 규율하는 방법으로는 세출 규율, 재정적자 규율, 국가채무 규율, 차입 규율 등이 있다.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적자 증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나 법을 통해 재정운용에 특별한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흑자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출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입확대를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균형재정의 달성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에서 볼 때 세출억제가 재정적자 해소의 최선의 방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건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총량적·거시적인 접근법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자원배분 및 성과의 개선을 염두에 둔 예산과정의 개혁이라는 ‘미시적’인 접근법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 美(미)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임 초기 대통령 직속으로 성과평가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을 신설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지출에 대해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부정부패의 여지가 없는지를 감찰하는 것이 성과평가관의 책무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사원은 통상적 지출에 대해 감사를 하게 하되, 경제위기와 관련된 각종 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성과평가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상황을 맞아 지금과 같이 예산이 크게 팽창할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예산집행에는 엄격한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정보가 없고 자신의 일에 바빠서 예산의 내용을 잘 모른다. 예산과 관련한 부정·비리·낭비·비효율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게 획기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횡행을 경계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재정·조세 관련 위원회가 여러 개 설치·운용되고 있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산하에 초당적인 장기재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는 재정지출의 대폭 팽창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요와 재원 조달,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재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재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조사·연구·심의하도록 한다. 필요시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문적 도움을 받도록 한다.
공공부문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제도 확립과 유인체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본질적인 구조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존치 여부를 시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시장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고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해외 성공모델 탐구
‘기술형 제조업’의 독일이 우리가 갈 길
⊙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중심의 제조업과
수출비중이 큰 경제구조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고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강국 이웃의 경쟁력과 장점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
李在郁 AT 커니 대표 파트너
⊙ 1966년 경남 마산 출생.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同 대학원 석사.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역임.

|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사진은 울산 현대중공업 도크.> |
대한민국은 지난 10여 년간 선진국을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왔지만, 2만 달러 문턱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제인구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 안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가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탈피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수산업을 적극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일면 타당해 보인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 경제구조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이다. 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라는 外風(외풍)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본주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과 같은 경제구조, 즉 내수중심, 고부가 서비스업 중심의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우리는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비시장이 없다. 수출시장에서 富(부)를 축적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 또 금융, 디자인, 기업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은 제조업 발전과 고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수시장의 성장도 수출시장이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내 경제구조가 가진 한계이자 특징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서비스업의 수출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법률, 금융, 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업은 언어 등 문화적 리더십이나 세계시장에서 쌓은 기업의 브랜드 포지션, 국제사회에서 국가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부가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할까?
다른 기술과 융·복합된 제조업 육성해야
필자는 독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중심의 제조업과 수출비중이 큰 경제구조로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유사하면서 서비스업과 내수시장의 비중이 조금 더 균형 잡혀 있고, 전체 GDP 규모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진국 수준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대한민국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고부가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제조업을 더욱 고부가가치화하고 親(친)환경산업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점점 IT, 통신, 소재, 금융, 심지어 예술 산업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이 일어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언급하는 제조업은 전통제조업의 융·복합과 발전을 뜻한다.
세계의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도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에만 의존해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해 미국發(발) 금융위기에서 확인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에 비해 부가가치 산출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금융산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액을 살펴보면 1차 산업(농림어업, 광업 포함)의 경우 1100만원, 2차 산업(제조업 포함) 5500만원, 금융을 제외한 3차 산업(전력, 가스, 수도, 건설, 서비스업 포함) 3300만원인 데 반해 금융산업(보험산업 포함)은 6200만원이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단기적으로 ‘글로벌리제이션’에 성공하여 國富(국부)를 창출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 금융산업전략을 준비하고 착실히 실천해 가야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세계 진출이 가능하다.
금융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는 ‘Lead Goose’전략이다. 한국 금융산업계에서 은행, 보험, IB를 통틀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기업은 아직 없다고 봐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표 금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즉 국제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소수의 국가대표급 금융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에서 삼성, 현대, LG, POSCO의 역할을 수행할 ‘금융의 Lead Goose’를 우선 만들자.
둘째, 해외진출은 동남아, 중국, 중동 등 제3국에 우선 진출하여 성공경험을 쌓은 다음 선진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자.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영국이나 유럽, 미국 시장에는 거의 진출하지 않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에 진출하여 탄탄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다른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건전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3국 시장은 경쟁환경 측면에서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은 선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현재의 삼성전자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금융경쟁력은 처음부터 HSBC, 씨티뱅크, AIG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전략도 그들과 달라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극복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기회
오늘날 많은 국민이 ‘남북 통일’에 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수준이 북한과 통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미국의 연구개발기관인 RAND 연구소는 ‘북한과의 통일비용이 약 67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남북통일은 국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면 2050년쯤, 남북한 국내총생산(GDP)이 독일과 일본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잠재력은 인적자원뿐 아니라 천연자원, 소비시장 확장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엄청난 통일비용 산정에는 북한의 GDP를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가정이 숨어 있으며, 이는 통일 한국의 GDP 규모가 전 세계 상위 수준으로 격상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확보한 경제규모와 막대한 잠재 내수시장은 미래 한국경제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Nut Cracker(넛 크래커)’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미래 한국경제 위기를 상징했던 단어다. ‘일본의 기술에 밀리고 중국의 원가경쟁력에 따라 잡힌 한국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의미다.
당시 이 단어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렸다. 하지만 그때 예측했던 10년 후 한국경제의 현재는 어떤가? 최근에는 일본에 가격경쟁력이 앞서고, 중국과 기술차별화를 이룬 우리 기업의 善戰(선전)을 두고 ‘逆(역)샌드위치론’이 대두되고 있다. 품질면에서 한국 제품이 일본에 뒤지지 않고 가격도 중국과 견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2030년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중국의 도약으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일본기업의 기술력으로 인해 무역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한국경제의 對日(대일) 기술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고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강국이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강력한 경쟁자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들 이웃의 경쟁력과 장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보물들을 옆에 두고 있는 수혜국일 수 있다. 긍정적・능동적 마인드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국가적 지혜를 모아 선진국을 향해 나가자.★
지식융합형 두뇌 가진 영재기업인 육성 전략
영재기업인 교육 통해 ‘한국판 빌 게이츠’ 양성
⊙ KAIST와 포스텍, 2010년에 ‘영재기업인 교육원’ 오픈
⊙ 2020년까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주도할 기업가 배출, 2030년까지 한국판 빌 게이츠
탄생시키는 것이 목표
李仁植
⊙ 1945년 광주 출생.
⊙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역임, KAIST 겸임교수.
미래의 기술혁명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이른바 융합기술(convergent technology)은 경제와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정부는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08년 11월 범부처 차원의 ‘국가 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2009~2013)이 수립되고, 2009년 12월 융합기술 지도가 완성됐다.
융합기술의 중요성을 결정적으로 일깨워 준 것은 2001년 12월 미국 과학재단과 상무부가 함께 작성한 정책문서다.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융합(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4대 핵심기술, 곧 나노기술(N), 생명공학기술(B), 정보기술(I), 인지과학(C)이 상호의존적으로 결합되는 것(NBIC)을 융합기술이라 정의했다. 또 2020년 전후로 융합기술이 인류사회에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까지 인간 활동의 향상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융합기술 분야로는 다음 네 가지가 선정됐다.
① 제조·건설·교통·의학·과학기술에서 사용되는 완전히 새로운 범주의 물질·장치·시스템: 이를 위해서는 나노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보기술 역시 역할이 막중하다. 미래의 산업은 생물학적 과정을 활용해 신소재를 생산한다. 따라서 재료과학 연구가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에서 핵심이 된다.
② 나노 규모에서 동작하는 부품과 공정의 시스템을 가진 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생물세포: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의 융합연구가 중요하다.
③ 유비쿼터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는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의 기본 원리: 나노기술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신속한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인지과학은 인간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④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이 뇌 연구에 새로운 기법을 제공한다.
융합기술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첨단기술과 첨단기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쏟아낸다. 기술 융합을 선도하는 분야는 정보기술이다. 먼저 정보기술은 자동차·조선·중공업 등 제조업과 융합하여 경쟁력 향상에 일조한다.
텔레매틱스
정보기술을 이른바 굴뚝산업에 접목시키는 대표적인 융합기술은 자동차 텔레매틱스(telematics)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과 외부의 정보센터를 연결하여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공간은 사무실, 자료실 또는 회의실로 바뀌게 된다.
정보기술을 기존 전력망에 접목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는 전기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력망에 정보기술이 융합됨에 따라 전력회사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소비자는 전기 요금이 싼 시간대에 전기를 쓸 수 있고, 전력 생산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전력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첨단기술 사이의 융합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령 정보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융합학문인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을 탄생시켰다. 생물정보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물학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므로 계산생물학(computational biology)이라고도 한다. 생물정보학의 발전에 따라 단백질체학(proteomics)과 시스템생물학(systems biology)이 급성장하게 됐다.
생명공학기술은 나노기술과 융합하여 나노바이오 기술을 출현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오칩(biochip) 기술이다. DNA칩, 단백질칩, 랩온어칩(lab-on-a-chip)이 여기에 해당된다.
DNA칩으로는 유전자를, 단백질칩으로는 단백질을 분석한다. ‘손바닥 위의 실험실’로 불리는 랩온어칩은 질병 검사에 필요한 여러 분석 장비를 하나의 칩 안에 집어넣은 생물학적 전자칩이다. 혈관 속에서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나노로봇 역시 나노바이오기술이 꿈꾸는 환상의 기계다.
녹색성장은 2030년까지 27개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은 2020년까지 조기 상용화 대상인 62개 스타 브랜드를,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50개 중점육성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두 139개 과제인 셈이다. 이 중에서 2020년까지 육성할 융합기술 과제로 38개가 선정됐다. 이는 ▲바이오·의료 분야 9개 ▲에너지·환경 분야 14개 ▲정보통신 분야 15개다. 38개 과제를 시장성과 성공 가능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15대 융합기술 중점과제를 확정했다.
▲바이오·의료 분야 5대 중점 융합과제: ① 바이오 의약품 ②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개발 ③ 메디컬-바이오 진단 시스템 ④ 고령친화 의료기기 ⑤ 기능성 식품 등.
▲에너지·환경 분야 5대 중점 융합과제: ① 스마트 상수도 및 대체 수자원 확보 ② 바이오에너지 ③ 고효율 저공해 차량 ④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처리 ⑤ 나노기반 융합 핵심소재 등.
▲정보통신 분야 5대 중점 융합과제: ① 가상현실 ② 융합 LED ③ 지능형 그린자동차 ④ 월페어 융합 플랫폼 ⑤ 라이프로봇 등. 15대 중점 융합과제는 세계 최고 선진국 기술의 62% 수준으로, 평균 격차는 4년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프로젝트를 계기로 융합학문과 더불어 융합기술이 산업계와 문화예술 분야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8년 3월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전문 교육기관인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AICT)이 문을 연 뒤 2009년 3월에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개원했다. 같은 해 3월 융합기술 중심 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가 설립됐다. 카이스트(KAIST)는 2010년부터 ‘지식융합’ 과목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미래융합기술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융합기술생산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의 융복합기술연구본부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융합기술 전문조직이 구성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카이스트의 문화기술(CT) 대학원을 비롯해 포스텍,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술대, 연세대의 미디어아트연구소 등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판 빌 게이츠’를 기다리며

지식재산 사회에서는 지식재산이 기업의 시장 가치를 좌우하는 ‘창조경제’가 핵심이 된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기업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지식재산 기업을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은 영재 기업인이 배출되지 않으면 세계 지식재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창의력이 남다른 발명 영재들이다.
또 MIT는 융합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일구어내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컴퓨터과학·인공지능 연구소(CSAIL)’와 ‘집단지능센터(CCI)’를 운영한다.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혼자 힘으로 산업 하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지식 융합형 두뇌(brainware)를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특허청이 주도하여 지식 융합형 두뇌를 가진 영재 기업인 육성 체제(www.ip-gifted.org)를 구축했다. 청소년 중에서 소수정예의 발명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지식융합과 기업가 정신 등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똑같이 ‘영재기업인 교육원’이 문을 연다. 카이스트에서는 미래기술, 지식융합, 기업가정신, 지식재산권, 미래인문학을 강의한다. 포스텍은 현상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 혁신을 주도할 영재기업인에게 필요한 가치창조(미래기술을 볼 수 있는 선견 및 통찰력), 가치획득(미래기술 개발 능력), 가치전달(미래혁신기술의 사업화 능력) 역량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허청, 카이스트, 포스텍의 지식재산(IP) 기반 영재기업인 교육 목표는 2020년까지 현상파괴적 기술 혁신을 주도할 기업가를 배출하고, 2030년까지 한국판 빌 게이츠를 탄생시키는 데 있다. 지식융합형 두뇌를 가진 영재기업인이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쏟아져 나온다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의 혁신
청년의 역동성에 기반을 둔 창업형 국가 건설해야
⊙ 한국의 경제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체제가 지속되어 세계적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있으나 세계적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기업은 不在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분야는 30대 이하의 청년세대가 적극 진출하기를 원하는 분야
邊熙宰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 1974년 서울 출생.
⊙ 서울대 미학과 졸업.
⊙ 現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미국의 경우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등의 글로벌 미디어기업, 파라마운트 등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인터넷기업 등이 제조업의 경제 영향력을 뛰어넘어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 덕택에 미국의 25세 청년인 마크 주커버그와 크리스 휴스는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회사를 창업, 3년 만에 2조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오랜 동안의 자본과 기술 축적이 필요한 제조업과 달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의 경우 진취적인 도전 정신과 신기술 개발력 하나로 단기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 영역의 力動性(역동성)을 살려내야만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韓流(한류)에 힘입어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미국 다음의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도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는 人的(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 탓이다.
한류와 인터넷 빅뱅은 金大中(김대중) 정권과 盧武鉉(노무현) 정권 시절 시작됐다. 이 두 정권은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지속시키는 정책보다는 문화 권력과 인터넷 권력을 정치적으로 악용, 독점 권력을 키우며 시장을 급속히 위축시켰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몇몇 연예기획사들이 문어발식으로 시장을 잠식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차단시켰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수혜자인 한국의 포털은 강력한 검색기술 개발보다는 미디어 권력을 침탈하는 데 골몰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내 언론계를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사업모델로 변질됐다. 이 때문에 기형적인 한국의 포털은 대기업과는 달리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국내용으로 전락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결정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도 수십 년째 방송 3社(사)가 독점하면서 콘텐츠 시장 역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20대 위기론이 20대 포기론으로 확산
그러나 모든 청년이 이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8%대에 이르게 됐다. 일자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몇몇 거대기업 이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청년 이직률 상승, 청년 실업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20대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패배감이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론’을 시작으로, 20대 위기론을 넘어 20대 포기론으로까지 비관적 담론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親盧左派(친노좌파) 세력은 2008년 촛불 광기 이후, 20대를 反(반)정부 투쟁의 전위부대로 인식, 끊임없이 20대 위기론을 과장 선동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의 경우 무정부주의 경향을 보이는 20대들이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여론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20대들의 무기력증, 이로 인한 무정부주의 경향은 친노좌파 세력이 선동한 탓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 등 중도우파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이고 비전 있는 代案(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탓도 크다.
대한민국의 30대 이하 청년들은 1992년 金泳三(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세계화의 수혜를 받은 첫 세대다. 세계화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누구나 배낭여행 한 번쯤은 다녀올 정도로 손쉽게 해외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해외진출에 적극적이었던 산업화 세대들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높은 고층빌딩에 주눅 들던 일은 요즘 청년들에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일일 뿐이다.
또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인터넷 영역에서 자유롭게 전 세계의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웹사이트와 콘텐츠가 그 어떤 나라의 것보다 우수하다는 점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 전자제품, 엔터테인먼트 상품, 인터넷 거래 등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최고의 IT기업들이 한국의 청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베타서비스(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의 정식버전이 출시되기 전,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점검하고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 정식 서비스 전에 공개하는 미리보기 형식의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소비자 리포트를 얻기 위해서다. 이러한 ‘똑똑한 청년 소비자’ 덕택에 인터넷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역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리더가 없는 20~30대
문제는 이런 소비자로서의 능력을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똑똑한 소비자는 언제든 똑똑한 생산자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 외에 경제와 정치 분야의 참여의 길이 막혀 있다.
이제 40이 넘은 386세대가 30대였을 때, 그 세대는 각계각층에서 리더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대표적인 386 주자인 任鍾晳(임종석) 의원은 2000년 3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68년생인 ‘다음’의 이재웅 대표는 1999년, 32세의 나이에 자신의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켰다.
문학계에서는 공지영을 비롯한 386세대가 1990년대 문단의 흐름을 주도했고, 영화계는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이 30대 초반부터 기대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대부분 사회의 주류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면 현재의 30대인 1970년대생 중에는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하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의 리더가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20대와 30대의 비전과 잠재력을 국가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통로가 없다는 점을 뜻한다.
GDP 2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맞으려면 가장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시장질서로 볼 때 가장 낙후된 대중문화와 미디어, 인터넷 분야에서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대와 30대 스스로 강력한 정치·경제 決社體(결사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친노좌파 386세대들은 그 이후의 세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인터넷과 대중문화에서 독점 권력을 형성, 이를 정치에 이용하는 데에만 골몰한다.
반면 산업화 세대가 중심이 된 중도우파세력은 큰 차원에서는 대중문화와 인터넷시장 개혁 측면에서 청년세대와 뜻이 맞지만, 섬세한 시장 정책에 대한 감각이 뒤떨어진다. 20대와 30대가 스스로 정치세력화하여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 시대적 이유다.
20대와 30대가 정치·경제 결사체 구성에 성공한다면, 김대중 정권의 자금 지원 중심의 벤처창업 정책을 넘어, 미국식 인큐베이팅이 강조되는 새로운 청년 창업 정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다. 또 대중문화 시장과 인터넷 시장을 개혁, 이 시장이야말로 가장 進入(진입)과 退出(퇴출)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발전시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親美(친미)와 反美(반미)를 뛰어넘어, 아시아 문화·경제 공동체를 형성, 청년들의 문화와 경제 활동 영역을 아시아로 확장시키고, 이 기반을 통해 미국과 유럽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진취적인 사고가 청년들에게 형성된다면, 친북의식이라는 고질적인 벽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북한을 이끌며, 몽골 및 유라시아 코리아 연방에까지 상상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反(반)기업 정서도 극복될 수 있다. 청년들 입장에서의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극소수의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다수 청년의 불만이다. 대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국제 경쟁을 하고, 청년들은 新(신)분야에서 창업으로 돌파하면서, 대기업과 청년기업이 손잡고 세계로 나가게 되면 기업에 대한 반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GDP 4만 달러의 국가가 되려면, 경제 성장이 1차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형 국가 건설로 가능하다. 본질적으로는 친미와 반미, 친기업과 반기업,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갈등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는 先後(선후)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오바마 세대의 혁명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청년세대 혁명이 곧 4만 달러 국가 건설의 시작이다.★
미디어 强國 전략
벽을 없애라!
⊙ 정보의 벽, 정책의 벽, 산업의 벽, 미디어와 채널의 벽을 허물면 4만 달러 진입 가능
⊙ 신문과 방송, 통신과 인터넷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제5의 뉴미디어 디바이스가 등장할 날 멀지 않아
河東瑾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1955년 경남 산청 출생.
⊙ 부산고,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와세다대학원 국제정치 전공,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 MBC 보도국 기자·도쿄특파원·국제부장·보도제작부장, iMBC 대표이사 역임.

| <미디어와 채널의 벽을 허물어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케이블 TV의 모든 것을 보여준 `KCTA 2008 디지털 케이블 TV 쇼’의 모습.> |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 원동력으로 미디어와 정보기술 분야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기술과 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도 2008년 10월 디지털 국가전략 정책으로 ‘디지털 플랜 2012’를 발표하고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미디어 업계를 살리기 위해 미디어 구조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이 단순히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디어산업을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와 통신산업계의 내부 환경은 기술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할 정도로 비교적 성숙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 지원과 인력 양성, 콘텐츠 유통과 개발 등 주변 환경은 보충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우선 방송과 통신, 신문, 인터넷의 경계선을 허무는 일이다. 현재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의 방송진출이 일차적으로 허용됐다. 방송의 경우 소유와 규제가 일부 풀리고 종합편성 채널이 허용됨에 따라 방송업계 내부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방송 부문의 규제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로 이어지고,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송은 방송대로 새로운 미디어와 채널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원소스 멀티 유즈’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채널별 디바이스별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 합리적인 공급 체계 구축, 그리고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 체제 보편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문의 한계를 극복하라
신문은 아직 활자 정보 서비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을 위한 디바이스나 콘텐츠 개발에는 역량과 투자가 부족하다. 신문의 방송업 진출이 보다 큰 차원에서 신문과 방송의 콘텐츠 융합을 위한 진출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문업계의 경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방송계 진출이라면 오판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검색포털과 출판유통업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e-북은 향후 복합 정보매체 디바이스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신문업계가 투자와 기술개발을 집중해야 할 분야는 방송 진출보다는 오히려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해 주는 스마트 폰과 e-북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서비스 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구글과 머독이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의 결과는 향후 인터넷 서비스에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업계와 웹 서비스 업계가 어떤 모양의 협조를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통신과 인터넷 콘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제5의 뉴미디어 디바이스가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
두 번째 사안은 디지털 콘텐츠의 융·복합 서비스의 실현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유무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따라 웹 TV, DMB, 와이브로(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IPTV 등 콘텐츠의 유통창구가 다양화하면서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플랫폼보다는 방송 콘텐츠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긴 했으나, 콘텐츠 제작자의 영세성과 비합리적인 유통 체계 때문에 늘고 있는 콘텐츠의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방송, 통신 콘텐츠 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경기 둔화와 서비스 시장 포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TV의 진화

이를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콘텐츠 산업의 제작과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또 디지털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채널별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 개발과, 개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융·복합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가 갖게 된 새로운 기능이 양방향 서비스와 개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안은 디지털 입체방송의 조기 실현이다. 방송을 시청하는 가장 전통적인 디바이스인 TV가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과 함께 시작된 PDP와 LCD TV 모니터는 100인치가 넘는 대형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선명한 컬러, 사실감 있는 화면, 수명 연장과 경비 절감 등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OLED TV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화면의 대형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가전업계의 총아로 각광받게 될 것은 3D TV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상용화된 제품이 시중에 선을 보이고 있으나, 3D TV는 조만간 TV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3D TV 전용 콘텐츠 제작은 TV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과 디바이스, 양방향 서비스에 3D라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킬러콘텐츠라는 점에서 그 폭발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안은 모바일 산업의 서비스 정책과 콘텐츠의 개발에 개방이라는 바람을 불어넣는 일이다. 국내 이동통신 정책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이통업체 위주의 유통구조와 실질적 망 개방 미흡이라는 문제다.
모바일 콘텐츠 제작업체의 진출·입이 실질적이고 자유롭게 허용되어야만 모바일 서비스와 콘텐츠의 발전 환경이 조성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업체의 망 독점으로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사실상 퇴보를 거듭했으며 와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새로운 서비스
한편, 차세대 모바일 기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의 발전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분야가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산업의 발전이다. 커넥티드 단말기란 무선 랜 등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풀브라우징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 그룹인 커넥티드 디바이스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PMP, 휴대용 게임기, 넷북, 디지털카메라, PND(Potable Navigation Device), e-북 리더(reader), 보안 단말기, 헬스케어, 운송, 자동차 내비게이터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디어업계의 몇 가지 관심 사안은 국민 소득 4만 달러 목표 실현에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 부진과 고용 창출력 약화, 그리고 혁신능력 부족이 그것이다. 투자와 고용창출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은 연구 개발과 국제 경쟁력의 제고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조건과 환경과 법, 제도 등을 여건에 맞게 변형·정착시키고, 통합적 사회 구성과 운영 원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벽을 없애라! 정보의 벽, 정책의 벽, 산업의 벽, 미디어와 채널의 벽을. 그러면 4만 달러 실현의 날은 더욱 빨리 올 것이다.★
⊙ 위조 상품 구입, 불법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온다
高廷植 특허청장
⊙ 1955년 서울 출생.
⊙ 중앙고, 서울대 화학공학과 졸업. 미시간대 응용경제학 석사, 화학공학 박사.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 에너지정책 자문관, 駐오스트레일리아 상무참사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장·자원정책심의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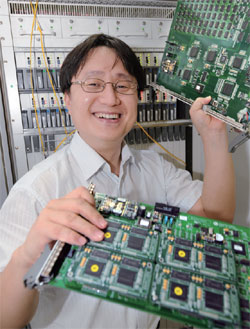
| <183개 특허를 보유한 SKT 김진식 매니저. 고교시절부터 발명에 관심을 가진 그는 18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5%의 개선도 어렵지만, 새로운 접근방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30%의 혁신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 3~4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이 곱씹어 보아야 할 말이다. 과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으로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지표라는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전략의 중심에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特許(특허), 商標(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됨에 따라 이른바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주요 선진국 기업들이 후발기업을 견제하고 시장을 지키는 수단으로 1980~1990년대 ‘반덤핑 제소’가 사용됐다면, 지금은 ‘특허소송’으로 후발기업들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특허괴물’이 등장해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겨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 중의 하나는 한국을 지식재산 强國(강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강한 지식재산권의 획득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계 일류 지적재산권 보유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하고, 국가는 범국가적인 親(친)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만 달러 달성이 제조업 기반에서 가능했다면, 4만 달러 달성은 지식재산 경제에서 가능할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10개만 있다면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2008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은 국내 GDP의 7.1%, 수출은 11%를 차지한다. 이는 삼성전자가 ‘특허 없이 미래 없다’를 외치며 전 세계 기업 가운데 미국 내 특허등록 2위를 차지할 만큼 공격적인 특허경영을 펼친 결과다.
기업의 핵심자산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급부상한 원천·표준·핵심특허 등 강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일류 기업들을 계속해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을 부품들의 결합체’로 인식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품을 국제특허의 복합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퀄컴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만 5조원이 넘는 로열티를 챙겨 갔다. 퀄컴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모뎀칩에서만 1700여 개의 국제특허 복합체로 구성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 원천특허를 확보한 한국의 ‘엠피맨닷컴’은 단 3건의 특허만 보유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실은 왜 우리가 강한 지적재산권의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이렇게 제품과 기술을 국제특허 복합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은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특허 포트폴리오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주요 경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시장의 발전방향을 분석한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제품과 이를 구현할 원천·핵심특허 등으로 구성된 미래 최강 특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전략은 스스로 연구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라이선싱하거나, 他(타)기업의 특허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필요한 특허의 획득이 어려우면 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60여 개 기업이 지적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사업을 추진한 결과, 1396건의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특허의 획득전략, 282개의 연구개발(R&D) 전략, 676건의 신규 특허 출원(예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허권 획득이라는 최종 결실을 맺게 되는 3~4년 후에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特許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기업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특허 마인드를 갖춘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것이다. 특허 마인드를 가진 엔지니어는 새로운 법칙이나 기술을 발견·개발하는 통상 과학자의 모습에다 인간이 만든 규칙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R&D 결과로 특허가 생산된다는 종래의 인식과 달리,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R&D 전략을 수립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엔지니어에게 특허 마인드를 심어 주기 위해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기본 특허지식을 갖춘 엔지니어를 배출해야 기업은 특허 분쟁 대응 등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특허에 강한 엔지니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버클리대 등 미국의 주요 대학은 특허교육을 공학교육의 일부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허 마인드가 몸에 밴 인재들이 향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경영자(CTO)가 되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무장한 기업을 만드는 핵심 주역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지식재산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엔지니어 양성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인 영재 기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퍼드대학 컴퓨터공학과 동료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는 1998년 작은 창고에서 구글(Google)을 창업했지만, 10년 뒤인 2008년 구글은 21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개국 약 1만7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두 英才(영재) 기업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LG, 포스코보다 주식가치가 더 큰 기업을 만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의 기반 위에 최고의 영재들이 지식재산으로 구글 같은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은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지와 변화가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의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이미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적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특허를 중시한 미국은 2008년 ‘Pro-IP’ 법으로 불리는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 법’을 제정했고,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해 국가 주요전략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小泉) 총리가 자신의 정부를 ‘지식재산 내각’으로 명명,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면서 자신이 본부장에 취임하는 등 지식재산 입국을 천명했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의 관심 속에 2009년 7월 국가 지식재산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13개 부처와 공동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지식재산기본법 立案(입안) 지원,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의 형성,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 국가 기술혁신시스템과 지적재산권과의 정책 연계 조정 등 국가 지적재산권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세계 33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과 대학, 정부의 노력은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는 ‘짝퉁 상품’이 넘쳐나고 있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수도 33위(2009년)에 불과하다. 僞造(위조) 상품 구입, 불법 다운로드 등 우리가 무심코 하는 수많은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문화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보호의 정도와 1인당 국민 소득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200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증적 분석결과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을 산업계, 학계,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가 2만 달러의 제조업 강국을 넘어, 4만 달러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과 가족, 다문화 가정의 가능성
여성인력, 多文化가 국가경쟁력 높이는 동력원
⊙ 일·가정의 조화를 도모하는 기업,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족, 多文化 가정의 다양성을
흔쾌히 인정해 줘야
⊙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 68(2008)위, 61(2009)위에 불과
咸仁姬
⊙ 1959년 출생.
⊙ 무학여고, 이화여대 사회학과, 同 대학원 사회학 석사, 미국 에모리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 이화여대 교수,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現 이화여대 이화리더십개발원장, 한국대통령평가위원.

| <한국이 아시아권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주자들의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사진은 2009년 10월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호프키즈 서울’ 발대식 모습.> |
2001년 매킨지 컨설팅社(사)가 발표한 ‘우먼 코리아 리포트’의 결론은 명쾌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소득 4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글로벌 무대에서 1등 하는 기업이 3개 정도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성장동력은 여성 전문인력이다.”
매킨지의 주장인즉 보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하에서는 고학력 고숙련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는데, 일차로 남성 및 외국인 브레인으로 채우고도 노동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기때문에, 과도하게 死藏(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 전문인력 활용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10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M)’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에 68위, 2009년에 7계단 상승하여 6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의 일원으로서 매우 불만스러운 지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 중간 관리자들이 조직 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첫째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을 위한 정책의 현실화, 둘째 여성을 위한 경력개발 및 리더십 교육의 체계화, 셋째 네트워킹과 멘토링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처음 이슈화되던 시기 정책의 주요 타깃은 ‘일하는 엄마’였다. 일하는 엄마들이 낮엔 직장 일, 저녁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역할부담의 과중함을 이기지 못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커리어와 자녀 출산을 ‘빅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한국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 곡선은 뚜렷한 M자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률이 하강 곡선을 그리는 시점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몰입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를 아우르는 시기다. 이때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여성들은 저학력・저소득층이라기보단 고학력 전문 인력이다.
일 우선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일·가정 양립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저출산’ 상황에도 가속이 붙었다. 여성의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통계청의 보고는, 커리어냐 자녀냐 둘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해 온 일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반영하고 있다.
맞벌이가 규범화되고 저출산이 국가 의제로 부각되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동시에 저출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성친화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직장 탁아, 유연시간 근무제는 기본이고, 퇴근 후 가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가족과 일의 조화를 중시하는 태도는 남성에게도 필수가 되어야 한다. 만일 여성에게 보다 철저한 직업의식이 요구된다면, 남성에게는 진지한 가족의식이 보강되어야 한다.
일찍이 아빠를 위한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했던 서구에서도 초기엔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분위기가 곧 반전되어 아빠를 위한 출산 휴가, 자녀 病暇(병가), 육아 휴직제를 선택하는 남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성들도 ‘일 우선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때 ‘산업시간’(industrial time)에 밀린 ‘가족시간’(family time)의 희생을 복구하는 동시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 내 소외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경력 단절을 만회하고 제2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고학력 전업엄마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간파한 미국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고학력 경력 단절 엄마들을 위한 조언은, 첫째 진정 제2의 기회를 원하는지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둘째 자신감을 회복할 것. 셋째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 넷째 자신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업그레이드할 것. 다섯째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재진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 여섯째 가까운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심양면 지원을 받을 것. 마지막으론 제2의 기회를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다.
미국 엄마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유능한 여성들이 출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 이후 자녀의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려는 ‘과잉 모성’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저출산의 위험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화두는 多文化(다문화) 가정의 도전에 현명하게 응전하는 일이다. 초창기 세계화의 핵심이 超(초)국각적 자본의 이동이었다면 오늘날 세계화의 주역은 사람의 이동, 곧 이주(migration)다. 한국사회에도 이미 외국계 주민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제 대학 강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부탄에서 유학 온 여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됐고, 지하철이나 대형 마트에서 이주 노동자와 마주치는 일도 일상적 풍경이 됐다. 대도시 근교나 농촌 지역으로 가면 100쌍 중 25쌍 이상이 결혼이민자 가정이요, 이들 1세대의 자녀가 벌써 중학생이 됐다.
多文化 사회의 경쟁력
1902년 12월 30일 인천항을 떠나 1903년 1월 1일 하와이에 도착한 103명으로 시작된 한국 이민史(사)에서 우린 명백히 이민 送出國(송출국) 자리에 있었다. 아주 근래 들어서야 이민 수입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한국계 이민자들이 외국 땅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난과 피눈물의 세월을 잊은 채, 우리 땅에 허드렛일 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조선족 아줌마들을 핍박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차별하는 걸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일찍이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적 성장동력을 확보해 온 미국의 경험은 후발 이주국가들에도 타산지석이 되어 줄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앞세워 용광로(melting pot) 이미지를 전파하면서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였던 미국은 지금 용광로란 허구적 비유 대신, 각 이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뿌리를 인정하면서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공유하는 이른바 ‘샐러드 바’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등장은 다문화 사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대명사라 할 GE, IBM 등에서도 사회적 소수집단을 주류 조직문화 속에 포용하는 다양성 매니지먼트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에선 여성들이 표방하는 가치관, 유색인종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신세대의 새로운 정서가 주류 문화와 소통 교류하면서,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해 내고 기존의 방식으론 해결 불능한 문제에 대해 기발한 해답을 찾아 내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동남아 화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계 중국계 인도계 미국인 등 ‘다중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 문학 영화 패션 등 예술 분야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은 더 이상 우리네 삶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됐다. 일례로 인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동남아 가족은 母系(모계) 지향성이 강한 특징에 더해 배우자와 가족을 구분하는 독특한 정서가 있다고 한다. 곧 혈연을 나눈 사람만 가족에 포함시키고 남편 혹은 부인은 단순히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 동남아 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서 어찌 건강하고 안정된 ‘다문화가정’을 바랄 수 있겠는가.
진정 다문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은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인정’한 후에, 우리와 다른 그들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나와 다른 피부색깔과 그들 문화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 위한 대전제는 자신감과 자긍심에 기초한 우리네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근거 없는 차별과 편견은 부당한 열등감과 허세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名品 公교육 통한 4만 달러 작전
교육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직과 봉사정신’
⊙ 미래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 소규모 기숙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人性을 기르고 핵심역량을
갖추는 것이 ‘명품 公교육’
金兌完 한국교육개발원장
⊙ 1948년 경남 창녕 출생.
⊙ 서울고,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同 대학원 석사, 미국 미시간대 석사(교육사회학·문학),
미국 미시간대 박사(교육재정).
⊙ 상인천중 교사, 미국 미시간대 강사·연구조교,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계명대 사범대학 학장 역임.

국민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私(사)교육 팽창 등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公(공)교육을 名品(명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명품 공교육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먼저 교육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직과 봉사정신’이다. 먼저 정직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의 부모와 교사는 자신들의 자녀나 학생이 공부를 못하면 매를 든다. 그러나 서양사회의 부모와 교사는 자녀나 학생이 정직하지 않을 때 매를 든다.
왜냐하면 한국은 시험을 잘 치면 성공하지만, 서양은 추천을 잘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시험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천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人性(인성)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직한 인간’이다. 서양사람들이 금과옥조와 같이 여기는 ‘정직이 최상의 정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라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 사건에서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이 있어도 정직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직한 인성의 중요성과 관련해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일 전 서독의 지도자들은 만약 통일이 될 경우, 경제체제는 서독이 동독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서독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체제는 혹시 물질 중심의 서독보다 정신을 강조하는 동독이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동독의 교육체제에서 취할 점이 있다면 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통일된 후 동독의 교육체제는 취할 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체제 전체를 서독식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동독의 젊은이들이 공산 치하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행동 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의 지도자들은 정직한 인간을 기르지 못하는 동독의 교육체제는 취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직한 인간, 봉사정신 함양
정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은 사회의 부패지수(corruption index)를 낮추고, 신뢰지수(confidence index)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부패지수와 신뢰지수는 경제의 선진화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부패한 사회에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으며, 신뢰도가 낮은 사회의 경제는 沙上樓閣(사상누각)과 같다.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국제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위기를 맞게 된다.
교육에서의 두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인 봉사정신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중요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서로 나눌 줄 아는 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는 쉽게 형성되기 어려운 습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후진국을 도울 줄 아는 심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OECD 가입 15년 만에 30개 회원국 중에서 23번째로 다른 나라를 돕는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했다.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아 온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국가가 되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격상되는 변화를 맞은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위상에 어울리는 봉사정신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명품 공교육을 위해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빌 게이츠는 모든 학생이 인종과 경제능력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난한 흑인들이 밀집해 있는 필라델피아의 도심에 최첨단 시설의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를 지었다. 미래학교는 현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흑인 학생들에게 최고의 명품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빌 게이츠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숙고등학교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자신과 부인이 운영하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뉴욕, 시카고, 보스턴, 오클랜드, 밀워키 등 주요 대도시에 500여 개의 소규모 기숙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있다. 그는 이 사업을 위해 이미 2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한다.
미국 기업계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게이츠가 이처럼 스스로 앞장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자 다른 지도자들도 교육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310억 달러를 게이츠재단에 기부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토크쇼 호스트인 오프라 윈프리도 4000만 달러(약 380억원)를 들여 남아공에 여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전액 무료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기숙학교 운동
이처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지도자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게이츠가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위한 작은 기숙고등학교 운동은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진국이 주목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와 같은 교육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명품 공교육을 위한 첫째 전략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정직한 인성과 봉사정신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전략은 모든 학생이 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전략은 소규모 기숙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인성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경제인 등 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과 핵심 역량은 학교교육만으로는 기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의 일년 동안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를 도입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판단과 실용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여행, 봉사, 사회활동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교육을 통합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의 약 30% 정도의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우리의 대학 논문 수준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하도록 하며, 자신이 정한 주제를 나름 탐구한 결과를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 준다. 좋은 교육은 방대한 양의 독서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말과 글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육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competency-based curriculum)을 도입하고, 소규모 기숙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인성을 기르고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숙학교는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선진국의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정리해 소개하면서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명품 공교육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이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며, 앞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서울의 미래 경쟁력- 컬처노믹스와 디자이노믹스
서울에 ‘문화’의 옷을 입혀라
뉴욕이 1년간 문화예술로 끌어들이는 관광객 수는 4000만명
吳世勳 서울특별시장
⊙ 1961년 서울 출생.
⊙ 대일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同 대학원 법학석사(상법)·박사(민사소송법)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역임,
MBC ‘오변호사 배변호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오늘과 내일’ 진행. 숙명여대 법학과 겸임교수,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최고위원),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역임.

|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디자인서울 간판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수간판으로 선정된 간판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다.> |
1년 전 다녀온 중국 순방길이 떠오른다. 당시 만난 황화화(黃華華) 광둥(廣東)성장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는 예정된 면담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경제성장 속도를 내게 알리는 데 할애했다.
“광둥성 인민의 노력으로 우리 省(성)은 현재 전국 GDP의 8분의 1, 조세의 7분의 1, 무역의 30%, 저축액의 7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관계도 연평균 13.4% 증가해서 무역액이 285억 달러에 이릅니다. 현재 한국의 광둥성 투자도 신고액 기준으로 25억 달러에 달하지요.”
외자 유치 액수만 봐도 최근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크니 여러모로 자랑할 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장과의 첫 만남에서 굳이 수치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며 장시간 성과를 알려주는 모습에서는 다른 의도가 읽혔다.
그들은 서울을 ‘넘어야 할 산’으로 보고 있었다. 서울시를 상대로 광둥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미묘한 氣(기) 싸움이었다. 그런데 광둥성장뿐만이 아니었다. 연이어 만난 산둥(山東)성장, 장쑤(江蘇)성장 모두 자신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그들을 만나고 있자니, 순방길 내내 과하다 싶은 환대를 받으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질문 하나가 떠나지 않았다.
‘과연 10년 후 서울시장도 이들로부터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보다 뒤처져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서울이 자신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아 대도시권의 도약이다. 중국은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톈진(天津)을 중심으로, 일본은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이미 대도시권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의 경쟁자는 이들이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21세기, 우리가 세계 선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뒤진다면 4만 달러 시대의 꿈은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드시티에서 소프트시티로 변신 중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를 간파하는 것은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한 답으로 나는 ‘매력’을 강조한다.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조지프 나이가 주장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량생산으로 물질적 풍요가 확산되어 가는 21세기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 문화와 상상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감성가치 등이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 ‘매력’으로 통칭한 것이다.
서울은 압축성장의 모델이 되는 도시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른 시간에 국민소득 1만 달러, 2만 달러를 달성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한 반세기 동안 우리 서울을 지배한 가치는 기능과 효율, 건설과 산업, 자동차와 속도 중심, 에너지 과잉, 역사와의 단절 등이었다.
나는 이를 ‘하드시티(hard city)’로 표현한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가 기대하는 가치는 다르다. 인간 중심의 도시, 보행자 중심의 도시, 자전거 속도를 음미하는 도시, 문화와 예술의 도시, 콘텐츠 중심의 도시, 역사적 맥락이 닿는 도시여야 한다. 나는 이를 ‘소프트시티(soft city)’로 부른다.
4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서울의 변신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프트시티로의 디자인이다. 소프트시티는 우리 서울을,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준다. 民選(민선) 4기 서울시의 비전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설정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수십 년 동안 효율성 위주의 도시로 성장해 온 서울을 감성가치가 살아있는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꺼내 든 두 가지 핵심 카드는 ‘문화’와 ‘디자인’이다. 문화와 예술이 서울 시내 곳곳에 물처럼 공기처럼 흐르도록 하고, 서울 전역이 디자인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와 디자인을 경제적 성장 동력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선 4기 서울시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컬처노믹스와 디자이노믹스다.
문화산업의 가능성
컬처노믹스란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적 碩學(석학)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이 앞으로는 문화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할수록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만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문화시설과 문화공연을 찾는 일명 ‘문화관광’은 이미 전체 관광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뉴욕이 1년간 문화예술로 끌어들이는 관광객 수는 4000만명에 이른다.
또 문화산업은,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보다 높다. 영국의 쇠락해 가는 탄광 도시였던 게이츠헤드는 각종 정책을 통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여 연간 23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 지역 대학졸업생의 정착률이 46%에 달할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자본은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 낸다. 도시가 문화의 옷을 입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그 도시에서 만든 제품의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한 문화는 제조업 기반이 13%에 불과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87%에 이르는 서울이 ‘고용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는 이미 시작됐다. 서울을 창의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연, 예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문화예술 장르별로 창작 스튜디오를 조성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콤플렉스와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통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갑이 얇은 시민도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공짜 혹은 저렴한 가격의 문화 공연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 역시 컬처노믹스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디자이노믹스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다. 우선 도시 디자인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개성을 부여한다. 동시에 디자인 산업을 통해 도시의 富(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디자이노믹스의 실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는 디자인의 불모지와 같던 도시 환경에 디자인의 씨를 뿌리고 디자인의 뿌리를 다져 왔다. 디자인총괄본부와 디자인재단 등 디자인 도시 서울의 비전을 이끌어 갈 조직을 구비했고, 도시 전반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했으며, 성냥갑 아파트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도심 건축물에 디자인 개념을 불어넣었다.
기적은 이루라고 있는 것
거리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시 디자인은 ‘그린 디자인’ ‘블루 디자인’ ‘히스토리 디자인’ 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활 녹지를 넓히고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그린 디자인, 도시 곳곳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서울을 매력적인 水邊(수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블루 디자인,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해 역사적 맥락이 읽히는 도시로 만드는 히스토리 디자인이 그 중심 내용이다.
그 결과 서울은 2010년 ‘세계 디자인 首都(수도)’로 선정되는 등 디자인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공 디자인 부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서울시의 디자인 역량을 산업디자인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산업 육성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이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한 디자이노믹스의 비전이다. 대한민국은 30년 전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底力(저력)이 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IT의 기적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는 문화와 디자인의 기적으로 다시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서울이 양손에 들고 선 컬처노믹스와 디자이노믹스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내는 데에 강력한 창과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기적은,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지방행정 사례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추진력 이끌어 내야
⊙ 함평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70억원,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에서 93억원 수입,
전체 생산유발 효과는 2886억원
⊙ 지방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세계 유례없는 축제 개발하여 성공 거둬
李錫炯 함평군수
⊙ 1958년 전남 함평 출생.
⊙ 함평농고, 전남대 농학과 졸업. 同 대학원 행정학 석사·농업정책대학원 석사.
⊙ 광주·전남 PD연합회장, 민선 2·3기 함평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전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現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함평세계나비·곤충 엑스포는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
요즘 인기를 끄는 <나비의 꿈(샘앤파커스 발행)>이란 책 서두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비가 함평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함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함평’하면 ‘나비’를 떠올린다.
10년 전만 해도 함평의 연간 관광객은 19만8000명이 고작이었다. 이제 함평은 5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함평 사람들 중 함평이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나비와 곤충을 주제로 한 국제 행사인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했다. 123만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만 93억원을 벌었다. 참고로 함평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은 70억원 내외다. 지역 전체적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2886억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에는 호주 지방정부 연찬회에 초청되어 나비축제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2009년 11월 8일에는 중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했다.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지역축제와 관광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과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함평 나비축제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함평이 주목을 받는 것은 표면적인 성과 때문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발상과 동기의 참신성과 창조성, 한국 농촌에 새롭게 제시한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 지방행정과 공무원의 역할,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기유발, 생태와 환경, 지역문화와 지역 브랜드 등 실험적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비축제라는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를 넘어, 함평=나비, 나비=함평의 브랜드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면서 점진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나비축제
함평나비축제가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는 밑바탕에는 함평군민의 뛰어난 자치의식과 親(친)환경농업의 실천, 생태환경 보전 노력과 같은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郡民(군민)들의 신뢰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 부서별로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전에 부서장 위주의 지시일변도 회의와는 사뭇 달랐다.
그 결과 민둥산에 40×50m의 대형 철쭉꽃 나비동산을 조성하고, 들판 1단지 전체에 자운영과 유채꽃을 이용해 초대형 나비문양 들판을 만들었다. 또 곤충연구소를 설립해 다양한 나비와 곤충의 생태를 연구했고, 필요할 때 언제든 나비와 곤충을 공급할 수 있는 배양 기술력을 습득했다.
나비생태관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꽃과 나무를 심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양서·파충류 전시관, 친환경농업관, 가축몰이 체험장 등 부서별로 아이디어를 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또 운영했다.
새벽 3시부터 꽃에 물을 주고, 비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나비동산 현장에서 따가운 봄볕에 검게 그을리고, 하얀 이가 유독 돋보이는 이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보면 틀림없다.
지방의 힘은 그 지역 공무원들이 핵심이다. 이들은 급료와 승진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떤 조직보다 강하다. 농촌지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무엇보다 단체장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작은 말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성실성을 겸비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획력이 풍부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서류작업은 약해도 현장에서 획기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직원도 있다.
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급료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마다 소질과 적성을 간파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일의 보람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장의 전결권을 확대해야 한다. 단체장보다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직원의 능력을 살리고 부서 전체의 힘이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공무원이 새로운 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한 만큼 손해라는 피해의식 때문이다. 일이 많을수록 보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을 일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벌받을 일도 많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일할 수 있도록 감사 정책에도 정상적인 고려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함평군의 인구는 3만7000명이다. 그중 3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393㎢의 면적도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작다. 벼농사가 전체 경지면적의 80%다. 가구당 평균 1.8ha를 경작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과 나비 브랜드 덕분에 나비쌀은 일반 쌀보다 40kg당 1만원을 더 받고 있지만, 특화작목 위주의 농업구조 개선 없이는 획기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례로 대표적 지역 특산품인 ‘함평 천지한우’는 지난해와 비교해 5000두 이상 판매가 급증하여 전체 3만 두를 넘어섰다. 함평의 가장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이 된 셈이다.
함평의 農家(농가)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한다. 耕種(경종) 농가는 10ha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하고, 축산농가는 소 100마리 이상 사육해야 가능하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가구당 10ha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인구는 5배 이상 줄어야 하고, 소는 6배 이상 더 사육해야 한다.
현재, 한국 농촌의 인구는 지난 몇십 년간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농가소득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인구 감소가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사육 적정선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소득 증대 위한 노력들
농촌지역도 하나의 산업사회이고,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축산물의 대량생산만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의 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문화-예술-관광 등의 문화적 가치들과 결합할 때 비로소 우리 농촌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농촌 소득증대의 해답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 친환경화, 그리고 지역의 개성과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작물과 가축을 재배하고 사육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쌀 생산 위주의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강제로 특용작물의 재배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기존의 영세하고 노령화한 농가를 농촌에서 몰아내는 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적이고 인위적인 품목전환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의 산업적 고도화를 도모해야 한다.
함평군의 경우 친환경적인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녹비작물인 자운영 재배면적을 늘리면서, 동시에 자운영 꽃을 관광자원과 벌꿀 밀원으로 활용했다. 또 주기적으로 농지의 성분 분석과 토양관리로 地力(지력)을 높였다. 3개의 곡물종합처리장(RPC)을 단일 경영체제로 통합하여 생산비와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관리의 통일성을 기해 16개의 브랜드를 나비쌀로 단일화했다. 판매에서도 판매량 사전 예고제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마케팅으로 판매단가를 높였으며, 이렇게 해서 함평 나비쌀은 전국 고품질 쌀 베스트 12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행정은 주민이 마음껏 뛰고 날 수 있도록 굳건한 구름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 官(관)은 民(민)이 믿음을 가지고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부가적인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지방 공무원의 역량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균형과 감각 있는 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주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지난 십수 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필자는 나비가 함평의 지역 브랜드 향상, 지역개발 촉진, 관광산업 활성화, 농특산물 판매증진, 주민의 경영마인드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도 시책을 펼칠 때 파급 효과를 서로 연계하고, 그 폭을 넓혀 나가는 창의적인 응용 노력을 지속할 때 우리 농촌도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만 美洲 한인 동포의 전략적 활용법
韓人 2세의 정체성 교육에 투자 해야
⊙ 해외동포 참정권 부여가 이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 정부의 미국 동포 정책은 정치적인 접근만 있지 전략적인 접근은 없다
金東錫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소장
⊙ 1958년 강원도 화천 출생.
⊙ 춘천고, 성균관대 정외과 졸업. 뉴욕시립대학 정치학 전공.
⊙ 1993년 한인유권자센타 설립, 뉴욕·뉴저지 한국어 투표서비스 성사, 한미 간 비자면제 프로그램
캠페인 전개, 미연방하원 일본군 강제위안부결의안 통과 주도, 2008년 의회도서관 독도명칭
변경저지 등의 활동 전개.

| <2009년 10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이클 블룸버그(왼쪽 두번째) 뉴욕시장과 하용하 뉴욕 한인회장(맨 왼쪽), 김경근(맨 오른쪽) 뉴욕총영사 등이 비빔밥 500인분을 함께 비비고 있다.> |
조지 부시 前(전) 미국 대통령은 2006년 갑작스럽게 이란과 북한의 核(핵)개발 억제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요구에 인도가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인도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중·러의 對美(대미) 戰線(전선) 결성의 빌미가 되었다. 외교 전문가들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는 인도系(계) 미국인들의 對(대) 의회 로비가 작동한 결과다.
미국에는 1300만명의 인도계가 살고 있고, 매년 8만5000여 명의 인도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다. 인도는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200% 활용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계 미국 시민을 민족발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도는 뉴델리에 대규모의 외교정책 싱크탱크를 설립하고, 인도계 미국인을 소장으로 영입했다. 이 싱크탱크는 인도계 미국 시민에게 인도의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대미 현안을 교육하는 일과, 인도계 미국 시민을 네트워크화하는 일을 맡고 있다. 워싱턴에서 만난 인도 외교관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들인 인도계 미국인들이 미국과 인도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필자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필자는 2005년, 지난 10여 년 동안 워싱턴 연방의회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상정되었다가 폐기되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결의안은 그 내용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늘 좌절되곤 했던 것이다.
일본의 로비를 이긴 美洲 교포들의 경험
필자는 韓人(한인) 동포들을 정치적으로 결집하는 시민운동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한인 동포들의 지나친 母國(모국) 지향적인 사고와 한국정부의 끌어안기식 동포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유대인까지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만계나 쿠바계,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계까지도 워싱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 비해 정작 대미 외교가 외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국은 워싱턴의 작동방식에 대해 어둡다.
필자는 2006년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가지고 연방의회에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문제’로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국 시민의 인권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또한 전국의 한인들이 자기 지역구 연방의원을 찾아가 로비를 하도록 했고, 워싱턴 DC에서 한인들의 힘을 결집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미국 외교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진 종족적 로비(ethnic lobby)는 그들 종족이 보유한 대규모 유권자 그룹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특정한 인종그룹에서 몰표가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들 인종의 표심을 진지하게 취급했다.
종족적 로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대계들이다. 1992년의 이란-이라크 무기 비확산법, 1996년의 이란-리비아 제재법, 2003년의 시리아책임법, 2006년의 팔레스타인 반테러법은 미국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의 발로로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그 밖에 1992년의 그 유명한 쿠바 민주화법도 쿠바계 미국인들의 정치력으로 제정된 법이다.
아르메니안이나 대만계도 시민로비가 막강한 그룹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던 그 시간에 연방의회에서는 與野(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서 대만에 무기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만계 미국 시민의 시민 로비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돈’로비나 정부의 외교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이 중국·소련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한국의 국가 이익은 미국과 거의 일치했다. 그 당시는 특별한 외교력이 없이 영어만 잘 구사하면서 워싱턴에 있으면 외교관 역할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는 單極(단극)의 시대가 되었고, 동시에 한국도 19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외교력만으로는 미국을 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에 줄 것보다는 받을 것이 훨씬 많은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만명 이상의 한인 동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동포 정책 없는 한국
현재 미국에는 우리의 전라북도만 한 韓人(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셈이다. 한인들의 3분의 2는 대도시인 서부의 LA와 동부 뉴욕에 살고 있다. 전체인구에 비하면 0.5%에도 못 미치는 소수이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실제 인구보다 훨씬 큰 커뮤니티로 인정되고 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릴 적에 이민 와서 미국서 교육받고 자란 소위 1.5세가 30대 중반이 되어 현재 한인커뮤니티의 主力(주력)이 되었다. 한인커뮤니티도 서서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주 한인 사회는 미국 전역에 이미 ‘韓人會(한인회)’란 이름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한 한인들의 결집력이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정부의 미주 동포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이 있더라도 미주 동포를 민족역량 구축이란 차원의 활용대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국내 정치 기반강화를 위한 정치세력화라는 목적으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결과 미주 한인들을 미국 시민사회에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동포들이 본국 정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족역량 구축이란 측면에서 미주 동포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일이 절박한 과제인데 참정권의 부여는 이들의 정치적인 에너지를 본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참정권 부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는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작동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자국계 2세들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문화와 역사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의 국가들은 자국계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할 때 오직 2세들의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자국을 지원하고 원조하지만, 2세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는 반대로 본국인 이스라엘이 투자하고 있다. 인도와 대만도 자국계 2세들의 교육에 정책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이 주류사회 내 핵심으로 진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한인커뮤니티와, 그리고 한국과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성공한 2세들의 정체성은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으레 성공한 2세들을 접견하지만, 실상 그 자리에 있는 2세들이 한국의 대 미국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인 신효범씨는 클린턴 정부 때 주한 미국대사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백악관은 그에게 “한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선택이 있겠는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 내 소수인종으로서 정체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해 주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의 한인 2세들을 위한 투자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명운을 거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한국 정부의 미주 동포 정책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없어 답답하다.
과연 앞으로 누가 워싱턴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오늘도 미국 내 한인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한국정부와 미주 동포의 관계는 지원과 수혜의 관계를 벗어나 투자와 활용의 관계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민족역량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올바른 미주 동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는 워싱턴의 작동방식을 잘 이해하는 동포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숙제다.★
4만 달러 국가 인프라 전략
30년 이상된 道路 중심의 투자, 鐵道로!
⊙ 철도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완비해야
⊙ 국가 주도로만 철도 투자할 경우 단기간 내 경쟁력 갖추기는 역부족
崔然惠 한국철도대학 총장
⊙ 1956년 대전 출생.
⊙ 대전여고, 서울대 독문학과 졸. 독일 만하임경영대 경영학 석·박사.
⊙ 한국철도대 운수경영학과 교수, 건교부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역임.

| <신고속철 차량 ‘KTX-Ⅱ’가 서울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기존 KTX가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를 그대로 들여온 것과 달리 KTX-Ⅱ는 국내 독자 기술(국산화율 87%)로 탄생했다.> |
‘투자의 鬼才(귀재)’로 일컬어지는 워런 버핏이 최근 3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기존 2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벌링턴 철도회사를 인수했다. 워런 버핏은 “미국의 미래는 효율적이고 잘 관리된 철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10년, 20년, 30년 뒤 더 많은 사람과 물자가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는 미국에 돈을 거는 것”이라고 했다. 내로라하는 선진국인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모두가 전통적인 철도강국이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철도 중심으로 전환해 철도투자를 도로투자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왔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汎(범)유럽교통망(TEN-T)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총 교통 투자액 1300억 유로 중 85%를 철도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전국 신칸센 철도정비법을 신설해 기존선 고속화와 신간선 직통노선을 확충하고, 2010년까지 철도화물 수송분담률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도쿄-오사카 간 마그레브열차(초전도자기부상식 열차)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세계 최고 철도강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동안 철도가 뒷전이었던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130억 달러 규모의 주요 도시 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철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철도차량 시장, 약 42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도 과거 30년 이상 정체됐던 철도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4년 KTX 개통으로 국가 교통망은 업그레이드의 전기를 맞았다. 특히 현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체계를 경전철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라, 고속화에 이어 철도기술의 다변화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는 日帝(일제) 시대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건설됐지만,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고,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게다가 철도기술 수출국으로 발전하는 등 세계 철도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철도의 성공은 1905년 경부선의 개통과 함께 철도학교를 설립해 꾸준히 우리 기술인을 양성해 낸 결과다.
세계 철도시장에 초점을 맞춰 보자. 2006년 세계 철도시장의 총 규모(철도차량과 철도건설)는 약 700억 달러 수준이다. 철도차량 시장만 보더라도 약 420억 달러 규모로 같은 해 조선 산업의 발주액인 46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45%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세계 1, 2 위를 다투는 반면, 철도산업의 시장점유율은 0.1% 정도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거꾸로 보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 그리고 域內(역내) 교역량 증가로 철도성장의 중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 철도강국인 유럽에서 향후 5년 내에 대규모 노후 차량 대체 시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철도는 세계 철도시장에서 신흥 철도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철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의 新(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첫째,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돼 온 道路(도로) 중심의 투자패턴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1962~1991년 동안 철도투자는 도로 투자의 20%에 불과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여전히 전년 대비 상승률에 집착하다 보면, 새로운 정책의 틀이 짜일 수 없다. 기존의 교통정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탄소·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수송수단 간 분담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철도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철도투자를 지금처럼 국가 주도로만 일관할 경우, 우리 철도가 단기간 내에 경쟁력을 갖추기에 역부족이다. 투자 재원도 감당할 수 없으려니와 국가 주도 사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工期(공기) 지연, 불합리한 건설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한 운영상의 구조적 적자재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정치적 입김 등이 작용돼 수요도 없는 불요불급한 공사가 되기 쉽다. 일본에서도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불황을 타개한답시고 100조 엔이 넘는 돈을 투자해 아무도 건너지 않는 다리, 산골에 들짐승만 뛰어노는 포장도로가 양산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간 투자 SOC 사업들은 국가주도 사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한 인천공항철도가 대표적 예이다. 이런 사례들을 거울삼아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철도, 그리고 역세권개발 관련 법제도 등을 과감하게 정비해 민간투자자가 철도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철도사업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철도시설이 혐오시설로 간주돼, 철도역이 낙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철도역이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다. 우리 철도사업자들도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경우, 과감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경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철도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철도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계 철도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南北(남북) 철도의 단절로 인해 섬 아닌 섬으로 남아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라시아 대륙은 이미 철도로 하나가 된 대륙철도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한반도 철도연결의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길 우려도 크려니와, 글로벌 철도 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철도산업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이익은 다양하다. 제품이 수출되는 자동차 등과는 달리 철도사업의 수출은 건설과 인력 수출이 동반되는 高(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빈곤한 자원 富國(부국)들의 추세가 그렇듯 철도건설과 자원의 대형 빅딜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철도 인력의 국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철도사업은 사업기간이 매우 길고, 기술 國粹主義(국수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철도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 등 꾸준한 교육 사업을 통해 신흥 開途國(개도국)의 철도 담당자들을 한국 기술에 친숙하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 분야는 産學(산학)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철도를 국가 미래비전과 연결시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정보통신(IT), 자동차, 조선 산업에 이어 우리 철도산업도 세계 최고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가 도래했다.
철도 SOC투자는 다른 경제활동에 막대한 乘數(승수) 효과가 있고, 혜택이 전 국민적이며, 국민복지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경기부양 효과, 타산업에 비해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국가 성장추진 동력으로 적합하다. 또한 京仁(경인) 운하사업, 4대강사업과 철도사업의 연계 개발을 통해 효율적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해 세계적 물류 SOC투자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 국가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위해 韓中(한중) 간 열차페리사업, 韓日(한일) 해저터널과 한중 해저터널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 회사원들, 출퇴근에 高價의 신칸센 이용
철도산업은 우리 경제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이끄는 견인차다.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국 구석구석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주는 철도망과 철도역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이어지는 대중교통망이 완비되어 있다.
파리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세계적 거대도시에서조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전철시스템과 자전거 도로망, 그리고 보행로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예컨대 일본은 기업 회계제도상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출퇴근용 철도패스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高價(고가)의 신칸센을 출퇴근시간에 이용하는 회사원들로 넘쳐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보조비가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대중교통카드에 대해서만 파격적인 보조금을 준다.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철도망을 확충해 미래사회의 폭증하는 교통수요도 감당하고 환경도 지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철도문화를 창달하여야만 우리는 진정한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4만 달러 철강산업 전략
業·場·動의 혁신으로 10년 내 매출 100조원 달성
⊙ 국가별 상황에 맞게 그린필드·브라운필드·M&A·합작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중
⊙ 과거 철강신화를 만들었던 경영방식만으로는 지속적 성공 보장받지 못해
朴基洪 포스코 미래성장전략실장
⊙ 1958년 부산 출생.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同 대학원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 뉴욕주립대 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국민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 기술로 생산한 쇳물이 제선출구를 통해 나오고 있다.> |
2007년 간신히 2만 달러 벽을 넘어섰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1만 달러대로 후퇴한 우리에게 4만 달러 달성은 힘겨운 목표다. 그러나 저 멀리 달려가는 선진국들과 기를 쓰고 쫓아오는 후진국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4만 달러 고지를 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포천 리스트>를 보면, 100위권 안에 든 한국 기업은 고작 4개, 500위권까지 포함해도 14개에 불과하다. 실망스럽기는 해도 이것이 우리 기업의 현주소다.
기업이 강해져야 국가도 부유해진다.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의 첨병이자 야전병인 우리 기업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근간이자 안정적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산업의 쌀’을 공급하는 철강산업은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아 경제발전의 버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8년 창립 40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현재 40조원대인 그룹 매출을 10년 후인 2018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사업분야와 사업범위, 그리고 사업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업분야(Business area), 즉 業(업)의 혁신이다. 2000년 민영화가 되면서 사명을 ‘포스코’로 바꾼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포항제철’이라는 이름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제철, 즉 철강을 떼어 놓고 포스코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포스코는 철강 전업기업이 아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가 일정 궤도를 넘어선 후에는 철강산업의 성장세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는 철강을 넘어 마그네슘, 티타늄, 리튬 등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들을 공급하는 종합소재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엔지니어링・건설(포스코건설), 에너지(포스코파워), 정보통신(포스코ICT)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해마다 이들 비철사업의 비중을 늘려 갈 계획이다.
또 친환경 녹색사업, 해양사업 등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하고 미래를 위한 씨 뿌리기(Seeding)를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사업범위(Business field), 즉 場(장)의 혁신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국가 간 교역이 어렵고 해외 진출에도 각종 규제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성장의 정체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룰은 통하지 않는다.
혁신운동의 미래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미래 성장시장으로의 上(상)공정(Upstream·쇳물을 녹여 열연코일·슬래브 등 중간 소재를 만드는 공정)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게 그린필드(Green Field·녹지나 미개발지 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는 개발을 의미), 브라운필드(Brown Field·기존 항만, 부지, 용수, 전력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개발), M&A, 합작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下(하)공정(Downstream·열연코일·슬래브를 2차 가공해 냉연코일이나 후판을 만드는 공정) 부문에서는 인도와 중국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전 세계 50여 개에 달하는 가공기지(SCM 기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방식(Business way), 즉 動(동)의 혁신이다. 사업분야가 넓어지고 사업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 철강신화를 만들었던 경영방식만으로는 지속적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날갯짓을 하듯이 포스코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변신을 시도 중이다.
그룹 구조에 맞는 운영 및 관리체계를 설계함과 동시에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성장지향형 인재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이고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POSCO Way’를 정립했으며, 이를 그룹 공통의 일하는 방식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흔히 목표 달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그만큼 풀코스 완주가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엄두가 나지 않는 42.195km를 완주하는 秘法(비법)이 있다고 한다. 지극히 당연해서 오히려 싱겁게 들리겠지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잘게 쪼개 하나하나 실천한다”가 그것이다.
10년 내 매출 100조원이라는 포스코의 목표도 일견 까마득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실천 과제들을 ‘업’, ‘장’, ‘동’으로 나눈 후,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하고(Pioneering POSCO),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며(Global POSCO), 창의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Smart POSCO) 어느 순간 100조원의 과실을 거머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업이 포스코와 함께 풀코스 마라톤에 도전하고, 그 결과 전 세계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우리 기업의 이름을 10개 정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4만 달러 고지를 넘어서고 있을 것이다.★
OECD 국가의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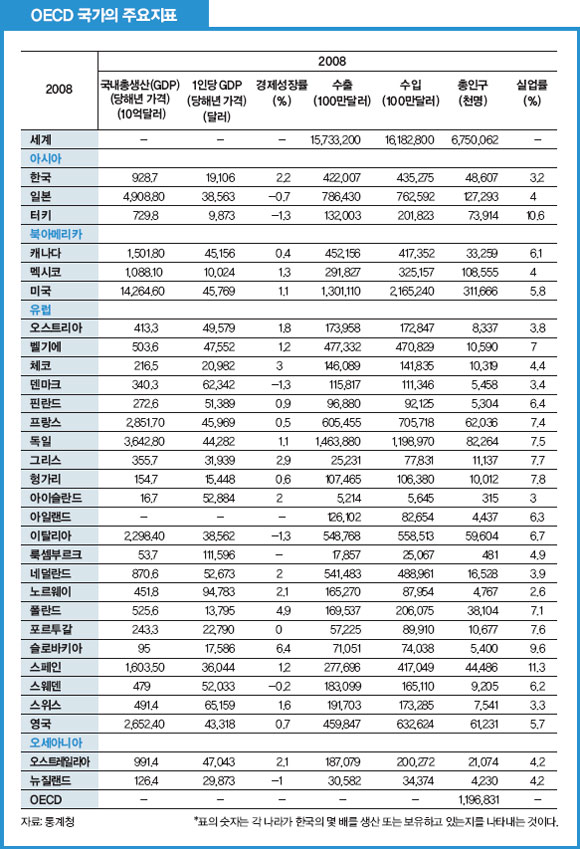
|
전통주를 세계적인 名酒로 신라주, 과하주, 동정춘을 아십니까? ⊙ 8조600억 원 규모의 국내 술 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 | ||
 | ||
|
국내 술 시장 규모는 2009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8조600억원 정도다. 이 중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가 약 3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전통주 제조업체도 막걸리 780여 업체를 포함하여 총 900여 업체로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 연구개발은 물론 품질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다.
규모가 영세해도 수백 년에 걸쳐 家業(가업)을 잇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외국의 유명한 술 족보는 교양을 위해 줄줄 외우고 다니지만, 수백 년 전통의 아름다운 우리 名酒(명주)들, 예컨대 梨花酒(이화주), 藥山春(약산춘), 洞庭春(동정춘), 三亥酒(삼해주) 등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日帝(일제)에 의한 우리 술 말살 정책과 함께 힘겨웠던 1950~70년대를 거치며 우리 술이 제대로 복원되고 자리 잡지 못한 탓이 크지만, 언제까지 아픈 역사만 탓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술이 세계적인 명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국내 술 시장과 술 문화의 기반부터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우리 술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수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국내에서조차 제대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술이 세계화를 꿈꾼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고, 설사 세계화가 된다 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규모 면에서는 현재의 매출액 기준 3% 수준보다 5배가 성장해 적어도 15% 선까지는 회복되어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에 와서 한국의 술 문화는 그냥 ‘알코올’을 마시고 취하는 그 자체의 행위에 집중됐다. 우리 선조들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와 예술’로서 술을 즐겼다. 우리는 선조들이 수립한 전통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비즈니스 측면까지 고려된 삼위일체의 산물로 만들어야 한다.
전통주 전문가 양성해야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 술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효과적인데,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와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20곳 이상의 사설기관 혹은 대학에 체계적인 아카데미가 설립돼 있다. 이곳에서 소믈리에를 비롯한 와인 마케팅 등의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와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사케가 국제화된 데는 키키자케시(사케 소믈리에)라는 사케 전문가의 활약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본은 전통주 교육 기관인 일본술서비스연구회를 두고 사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곳의 교육 과정을 밟는 한국 학생들도 상당수다.
한국에는 사설기관이든 정규 교육기관이든 양조 전문가 과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미생물이나 식품 관련 전공자들이 주정 회사에 입사한 후 양조학에 대해 별도로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부에서 우리 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술연구센터를 설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리술연구센터에서는 원료, 누룩미생물 및 기능성 관련 연구를 비롯해 응용기술 연구까지 수행할 것이라 한다. 이 기획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된다면 우리 술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과 같이 영세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는 국내 시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700~800여 업체에 대한 확실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방 특색을 살려 나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차별화된 R&D 및 시설투자, 그리고 경영 및 마케팅에 대한 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클러스터형 사업모델, 즉 우리 회사가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국순당 고창명주나 국순당 정선명주처럼 지자체와 농민, 그리고 기술과 마케팅 영업력이 있는 기업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식품 관련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시장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참여는 거대 자본과 독과점식 영업으로 영세기업이 고사할 위험성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건전한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간다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맛과 향을 글로벌 코드에 맞춰야 성공한다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다음 해야 할 일은 세계 시장 공략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맛과 향 등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한 현지화 전략이다. 우리 술의 본질적인 특성이 살아 있으면서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지만, 맛에 관한 한 최소한의 글로벌 코드에 맞지 않으면 우리만의 고집이고 아집이 된다. 막걸리가 과실주 문화권인 유럽이나 미주 지역보다 穀酒(곡주) 문화권인 일본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식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우리 술 본연의 맛을 표준화하고 그것을 단순히 술로서만이 아니라 韓食(한식)과 동반 진출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와인이나 사케도 그들의 식문화와 함께 글로벌화가 된 것처럼.
고급화 전략 역시 빠질 수 없다. 현재 수퍼나 할인점에서 1000원대면 막걸리 750ml를 살 수 있다. 생수보다 싼 가격이다. 심지어 1ml당 1원 미만짜리 막걸리도 많다.
이 얼마나 난센스인가. 대부분의 막걸리는 지하 수백m에서 뽑아 올린 천연암반수를 원료로 하여 국내산 청정미와 누룩, 그리고 효모로 수일에서 십수 일 발효시켜 제조한다. 그런데 어찌 그냥 지하에서 뽑아 올린 물보다 싸게 팔리고 있는가 말이다.
그렇다 보니 품질관리는커녕 제대로 된 스펙 관리도 되지 않은 열악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면 원료부터 제조방법, 포장까지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는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술에 얽힌 이야깃거리를 발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술인 와인의 경우 각 샤토마다 나름의 특색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고, 이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시키는 一石二鳥(일석이조)의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00년에 출시, 불과 1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국의 수정방이 세계 명주 반열에 들어선 것도 풍부한 이야기 덕분이다. 수정방은 생산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이야깃거리로 활용하여 무려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술로 변신, 세계 최고의 명주로 우뚝 섰다.
술은 종합예술이다
우리 술에 얽힌 이야깃거리는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찾지 않았을 따름이고 무관심했을 뿐이다.
당나라 시인 玉溪生(옥계생)이 새벽바람에 술기운이 쉽게 사라질까 두려워했다는 新羅酒(신라주)도 있고, 맛이 좋아 한 잔 두 잔 하다 그만 과거시험을 놓쳤다는 안전뱅이 술도 있다. 포트와인(발효 중인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한 포르투갈의 스위트한 주정강화 와인)이나 쉐리와인(발효가 끝난 일반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인 스페인 와인)보다 역사가 오래된 세계 최초의 혼성주인 過夏酒(과하주: 무더운 여름을 탈 없이 날 수 있다는 뜻의 술)도 있고, 논 한 평에서 생산되는 쌀로 한 홉의 술만이 나오는, 너무나 귀한 나머지 맥이 끊겨버린 동정춘이라는 술도 있다.
이처럼 재미있고 역사적인 우리 술의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고, 종합예술의 성격을 갖는 문화상품으로 육성해야 세계적인 술로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던 우리의 술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이해되고, 또 경쟁력을 가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되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지난번 농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잘 담겨 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0년은 우리 술 부흥의 元年(원년)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바로 우리 술이 세계의 명주로 우뚝 서는 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관광산업의 가능성
2010~2012까지가 관광산업 세계화의 好機
⊙ 관광산업은 ‘고용 없는 시대’의 유일한 돌파구. 10억원 투입 시 발생하는 취업유발계수가
52.1명으로 제조업(24명)의 2배, IT산업(9.7명)의 5배
李參
⊙ 1954년 독일 출생.
⊙ 슈타트마우어 김나지움고, 구텐베르그대 불문학과 졸업. 트리니티 시올로지컬 세미너리대
성서상담학 석사.
⊙ 韓獨상공회의소 이사, 해성엔지니어링, 참스마트 대표이사, KTF 사외이사, 예일회계법인 고문,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반도대운하 홍보대사 역임.

| <한국 관광산업은 2009년 여러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14.9% 성장했다. 사진은 2007년 4월, 한국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탄생을 기념한 축하행사 모습.> |
독일인이었던 필자는 1978년 한국에 와서 31년을 보냈고, 한국이 좋아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다.
그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독일과 다른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가?”였다. 그럴 때마다 “독일은 가능성을 다 써버린 나라다. 물론 계속 발전은 하겠지만 더 이상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면 한국은 잠재력을 다 쓰지 않은 나라다.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국이 좋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나는 그 가능성을 뜨겁게 사랑한다” 라고 답하곤 했다.
OECD가 2009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호주, 폴란드 등 3개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0년 성장률도 회원국 중 최고치인 4.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2010년에 G20 각료회의 의장국으로 아시아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는 지난 1960년대 OECD의 경제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반세기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놀랍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의 산업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빠르게 제조업 중심에서 전자, 기계, IT산업 등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체의 급속한 해외이전 증가로 제조업의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원활하게 흡수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이 1인당 GDP 2만 달러 문턱에서 최근 몇 년간 정체되고 있는 것은 ‘성장과 고용’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이다. 관광산업은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로 이끌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자신한다.
관광산업은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최종 단계의 선진산업으로, 그 나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산업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신흥개발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 무역거래량의 8%, 서비스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라고 한다.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133개국 중 31위
국내에서도 관광산업은 산업 평균을 웃도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뛰어난 외화가득률(88%)을 보이고 있다. 또 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화의 용이성, 그리고 10억원 투입 시 발생하는 취업유발계수가 52.1명으로 제조업(24명)의 2배, IT산업(9.7명)의 5배라는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나 고용비중은 각각 7.6%, 8.1%로 OECD 평균인 9.8%, 10.4%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달리 생각하면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T&TCI)를 발표한다. 2009년 한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지수는 조사 대상국 133개국 중 31위로 싱가포르(10위), 홍콩(12위), 일본(25위)에 뒤져 있다.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정보통신기술 인프라(8위), 문화자원(13위), 육상교통 인프라(15위), 인력자원(19위) 등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관광 인프라(71위), 자연자원(91위), 가격경쟁력(102위),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114위) 등은 매우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현재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성장 딜레마를 해결하고, 나아가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로 이끌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 관광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계의 관광 선진국 어디를 봐도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自國民(자국민)이 즐겁고 편한 관광지라면 외국인에게도 즐겁고 편한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관광객이 찾아오면 시설과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즉 국내 관광수요가 늘어나면서 관광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통계청이 만 15세 이상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45.1%)’을 희망하고 있다. 잠재적인 관광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부족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들어 관광의 주류를 이루던 3S[Sand(모래), Sun(태양), Sea(바다)] 관광에서 3E[Education(교육), Entertainment(기분전환), Excitement(자극)] 관광으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관광’ 중심에서 ‘자연적·사회적·지역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상호작용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대안적 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생태관광 상품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제주 올레길, 백두대간 탐방로, 슬로 시티(slow city), 순천만 등의 관광지와 전국의 지방문화축제 등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3S관광 중심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의 3E 관광지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신적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두 번째로는 관광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관광은 단순히 놀고 소비하는 소모적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생산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관광을 통해 삶의 여유와 균형을 잡아 줘야 한다. 다시 말해 일하는 것, 노는 것 둘 다 생산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2009년 11월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강화회의’에서 밝힌 선진국 대비 경직적인 휴가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는 휴가패턴을 연중으로 분산해 국내 관광업계의 수익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한국관광공사부터 새로운 관광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광 선진국들처럼 2주 정도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사회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우리 문화자원의 경쟁력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웅장한 건축물보다는 정신적인 가치가 담긴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한국처럼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등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서로 간에 알력과 다툼이 없이 조화롭게 우리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다만 原石(원석)을 아직 가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적 매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막걸리, 약주 등 우리 전통주는 재료나 제조과정 등에 웰빙적 요소와 더불어 집마다 맛과 특색이 있는 家釀酒(가양주)를 담가 마셨을 만큼 다양한 역사와 문화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관광상품으로서도 의미가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주를 그저 ‘싼 술’이라는 이미지로 그 가치를 폄하해 왔다.
오늘날 막걸리는 외국인, 특히 일본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열풍’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나쳤던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깨워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를 바로 알아가고 스토리텔링으로 다듬고 포장해서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한국 관광시장 14.9% 성장
세계관광기구는 2009년 국제관광시장은 -6~-4%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관광 경쟁국인 중국, 일본이 각각 2009년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24.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 관광은 9월까지 +14.9% 성장을 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신종플루 등의 惡材(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 700만명을 달성했고 연말까지 800만명을 기대하는 성장을 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가 계속되며, G20정상회의, 세계관광기구 총회,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여수 세계엑스포, 인천 아시안게임 등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대형 국제행사 등을 활용하여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적극 알리고, 한국 관광의 저변을 넓혀야 할 것이다.★
관광레저 산업을 통한 4만 달러 전략
‘보는 것’에서 ‘참여와 재미’로
⊙ 단순히 ‘보는 것’에서 ‘참여와 재미’로 바뀐 관광레저 산업 트렌드 주도해야
⊙ 관광레저 산업의 꽃, 카지노를 중심으로 세계적 종합 휴양 리조트 만들어야
崔領 하이원리조트 대표이사
⊙ 1952년 강원 강릉 출생.
⊙ 강릉고,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美 서던캘리포니아大 대학원 석사.
⊙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산업국장·경영기획실장, SH공사 사장 역임.
외국인 관광객 700만명 시대가 활짝 열렸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3일자로 7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희소식이 한 가지 더 있다.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新(신)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각종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야심 찬 내용을 담은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이 보고됐다.
오는 2020년까지 외래 관광객을 현재의 3배인 2000만명 선으로 늘리는 한편, 2008년 90억달러였던 관광수입을 2020년 300억 달러로 늘리고, 이를 통해 2008년 127만 개였던 일자리 창출 규모를 2020년 250만 개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성장 동력인 관광레저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향후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한다는 의욕적인 비전이다.
이전부터 관광레저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며 부가가치창출 능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다. 실제로 관광레저산업에 10억원을 투자할 때마다 유발되는 취업 인원은 IT산업의 5배가 넘는 52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역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전통적인 관점에선 관광레저산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캐니언의 웅장한 자태를 보기 위해 전 세계로부터 몰려든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자연이 주는 천혜의 관광자원 중 전 세계 관광객을 그러모을 만한 ‘에이스급’의 명소가 없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은 내국인용일 뿐이다.
마카오의 대약진
하지만 관광레저산업의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관광객들은 단순히 보는 것, 그리고 그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효용을 찾는 ‘경험적 요소’에 더욱 열광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성공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의료관광의 天國(천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태국의 경우, 외국 관광객의 40%가 의료관광객으로 2007년 한 해에만 154만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했다. 인도도 의료비용이 저렴해 의료시술을 받은 뒤, 나머지 1주일은 他地(타지) 마을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관광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스킨케어, 미용성형, 치과, 안과 등 의료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관광 테마다.
최근 ‘韓流(한류)열풍’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의 한류열풍을 주도했다면, 드라마 <대장금>은 아시아 전체에 한류 붐을 일으켰다. 한국 최대 규모의 외국 관광객인 ‘일본 주부들’은 드라마의 배경이 된 남이섬에 가고, 남녀 주인공이 걸었던 ‘메타세콰이어 길’을 걸으며 스스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은 대장금이 입었던 옷을 입고, 대장금이 만들었던 우리나라 궁중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열광했다. 이러한 열풍과 성공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세계 최고의 환락 도시로 유명세를 떨쳤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는 이제 세계 최고의 컨벤션 도시로 탈바꿈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MICE 분야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 영화, 음식, 전통문화, 아름다운 길, 스포츠 등 우리 일상의 많은 요소가 관광 콘텐츠로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集客(집객) 능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임에도, 우리 스스로 간과해 온 분야가 카지노다.
실제 카지노 산업은 ‘관광레저산업의 꽃’으로 불릴 만큼 그 효용이 대단하다. 세계 10대 관광大國(대국)이 세계 10대 카지노 대국과 거의 일치한다. 카지노를 통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입이 매년 발생되고 있다.
그 가운데 마카오의 약진은 실로 역동적이다.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이미 라스베이거스를 추월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6%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고, 2008년 한 해에만 약 13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아시아 국가 중 전통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불허했던 싱가포르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문화적 청렴도가 높고 부패지수가 가장 낮아 ‘세계의 도덕국가’를 표방했던 싱가포르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國富(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카지노의 합법화를 추진,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쇼핑몰, 대규모 공연장, 테마파크, 해양공원 등을 하나로 결합한 복합 리조트인 ‘마리나베이 프로젝트’와 ‘센토사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카지노 정책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카지노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이후, 2006년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공식기구로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소위원회’를 창설했다. 2011년 즈음엔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카지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카지노의 역기능보다는 관광레저산업 분야에서 카지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은 ‘적극적 카지노 산업 도입’이란 세계적 트렌드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총량제한, 전자카드제도 도입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핵심 분야인 카지노 산업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 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지노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다. 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하이원리조트의 강원랜드 카지노 사례를 보면 그 단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강원랜드는 강원남부 廢鑛(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 만큼 강원랜드는 사회적 공익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차갑다. 도박중독, 비자금, 조직폭력, 가정파괴 등 좋지 않은 이미지를 먼저 연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기능은 무엇일까?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로 지난 10여 년간 눈부신 매출 성장을 이뤄왔다. 이를 통해 國稅(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기금,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공공이익의 달성 등 수많은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창출한 경제유발효과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정선, 영월, 태백, 삼척 등 주변 도시와의 관광벨트화에 성공해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 이내에서 바다, 산, 계곡 등 자연경관 체험은 물론, 각종 박물관, 역사 유적지, 천문대, 템플스테이, 전통 농촌체험과 같은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포함하고 있는 하이원리조트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롤 모델’로 활용해 카지노를 포함한 대단위 컨벤션 중심지,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된 세계적인 종합 휴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싱가포르, 두바이, 마카오 등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가시화되면 하이원리조트는 대단위 카지노, 국제 규격의 스키장과 골프장, 숙박 위주의 특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비롯해 쇼핑몰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리조트로 완성될 전망이다.
카지노의 역사가 오랜 歐美(구미) 선진국에선 카지노를 단순한 여가문화, 재미있는 즐길 거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인식의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나라 내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카지노가 개방된 것은 10년이 채 안된다. 아직까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하지만 카지노 산업이 관광레저산업의 꽃이라는 것과 뛰어난 부가가치 창출 능력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10~20년 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관광대국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관광大國 코리아의 꿈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 2009년 9월까지 訪韓 관광객 650만명 넘어 전년 대비 15% 신장
⊙ 한국은 신흥 관광도시인 싱가포르나 두바이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
具三悅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
⊙ 1941년 서울 출생.
⊙ 경기고, 고려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졸업.
⊙ 코리아 헤럴드 기자, AP통신 뉴욕본사 국제뉴스 편집인. 유엔특파원, 유엔 아동기금(UNICEF)
홍보처 부처장, 외교통상부 문화협력대사,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국제관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삼열아, 네가 애쓰는 건 알겠는데, 되겠냐? 우리나라에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관광객을 1000만이나 부르냐….”
서울관광마케팅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가까운 지기들이 종종 염려 반, 위로 반 섞어 던지는 딴죽이다. 과연 우리는 관광大國(대국)이 될 수 있을까?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관광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대답은 주저 없이 “Yes, we can!”이다.
2009년 10월 서울미각도시화 프로젝트 및 韓食(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한식 축제 ‘어메이징 코리안 테이블’ 취재차 방한했던 歐洲(구주) 美洲(미주)의 음식 전문기자들은 며칠간 한식을 먹어 보고는 ‘일본의 기코망 간장, 멕시코 타바스코 소스처럼 한국의 장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날이 머잖아 올 것’이라는 찬사와 축복을 남기고 돌아갔다.
신종플루의 위협 등 관광산업에 그 어느 때보다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한민국의 관광성적표는 고무할 만한 수준이다. 9월 누적통계 기준, 訪韓(방한) 관광객은 650만을 넘겨 전년 대비 15% 신장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입국객 수가 500만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전년도보다 25%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흐뭇한 수치다.
吳世勳(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가 소리 높여 온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정책의 효과일까. 문화가 곧 힘이고 돈이 된다는 이 21세기적인 경제논리에 따라 관광산업 역시 여러 면에서 문화결합적, 테마지향적으로 다변화되어 오고 있다. 韓流(한류)관광, 의료관광을 비롯해 수학여행 유치 및 노인단체 교류까지, 단순히 경치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서비스를 즐기고, 나아가 상호 교류하는 수준으로 관광산업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연 250만명에 이르는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관광마케팅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수학여행 교류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졸업 전에 수학여행삼아 경주를 방문하듯이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 한두 번은 서로를 방문하고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노인단체 유치 및 의료관광을 주축으로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1억6900만명에 달하는 중국의 노인인구를 겨냥한 실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 수준만 종합해 봐도 ‘한국 방문의 해’가 끝나는 2012년이면 중앙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의욕적으로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인프라가 보강된다는 전망하에 2015년이면 1500만 달성도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두 인접국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그 대상도 다변화해야 한다. 동양인부터 서양인까지, 불교도에서 무슬림까지 세계인 모두가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는 배려다. 2009년 초,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내놓은 모토처럼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오랜 세월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탓일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 중 많은 수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악의는 없지만, 엄연히 인종차별도 존재한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로 인정받는 인천공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들과 서양 방문객들의 공항 대기시간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심각한 대기오염과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방콕이 계속해서 세계인들에게 관광지로 선호되는 이유는 외부인들에 대한 공평한 따뜻함이 아닐까 싶다. 과한 호객행위에 눈살은 찌푸릴지언정 태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관광객은 아마 없을 것이다.
中低價 호텔 확충 시급
둘째는 영어, 일어, 중국어를 기본으로 외래 방문객 비율을 고려하여 언어권별로 업그레이드된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세계적인 유명 가이드북 중에 한국이나 서울을 다루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극소수다. 있다 해도 부정적이거나 그릇된 정보,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론리플래닛> 등 저명한 여행서의 서울판 내용의 개선을 앞서 제안하고 영국, 프랑스 등의 유명출판사에 가이드북 제작을 권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어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외국어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외국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검색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불만-일어를 모르고서는 현지인들이 찾는 식당에 가거나 다양한 쇼핑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귀 기울여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는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확보하는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경이면 중국은 320만명, 인도는 170만명, 두바이는 30만명 가량의 관련 분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되며, 한국의 경우만 해도 40만~50만명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관광마케팅 컨벤션뷰로는 2008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컨벤션기구인 MPI(Meeti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의 지부를 설립하고 국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인 CMP(Certified Meeting Professional) 시험을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넷째는 특색 있는 시설 및 페스티벌 등 우리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얼마 전 이탈리아 로마에 완공된 현대미술관 막시(MAXXI)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작품으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 이름만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작업한 건축이나 작품은 그 자체로 랜드마크이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고유의 건축이나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는 자하 하디드의 명성에 그 사회문화적인 상징성이 결합해 두고두고 한국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함평 나비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처럼 잘된 지역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無(무)에서 有(유)를 창조했다고 평가되는 삿포로 눈 축제나 홍콩 음력설 축제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다섯째로는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이다.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남해의 아기자기한 섬들이나 한려수도로 이어지는 해안선의 아름다움은 그 유명하다는 이탈리아의 나폴리나 소렌토에 뒤지지 않는 절경들이다.
자연은 좋은데 이를 관광자원화하는 수완이 부족했다. 외국인으로서는 교통도 숙박도 식사도 불편하니 그림의 떡이었을 터이다. 내국인에게 인기가 검증된 고래탐사나 바다낚시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리나, 리조트 등을 갖춘 고급 휴양단지를 갖추면 세계 어디보다 아름다운 해양관광지가 탄생할 것이다.
세계 80여 개국을 여행해본바,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다. 산과 강을 풍요롭게 품고 있는 서울만한 도시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 남해의 해안선과 바다는 또 어떤가. 그리 크지 않은 국토지만 궁과 사찰, 한옥, 재래시장과 향취 있는 뒷골목까지 아기자기하기 이를 데 없다.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문화자산을 따지자면 신흥 관광도시인 싱가포르나 두바이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번 마음을 나누고 나면 친절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한식의 매력까지, 가꾸고 다듬어서 내놓을 밑천은 충분하다.★
호텔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中低價 호텔·맞춤형 잠자리로 내실 다져야
⊙ 한국은 특급호텔에 비해 하위 등급 호텔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 급성장 중인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상호 무비자 입국 협상 추진해야
左祥奉 롯데호텔 대표이사
⊙ 1953년 부산 출생.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뉴욕주립대 대학원 MBA.
⊙ 삼성그룹 회장비서실 국제팀, 삼성전자 동경주재원, 삼성자동차 해외업무팀장·감사팀장,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호텔롯데 경영관리본부 상무, 롯데쇼핑 정책본부 전무 역임.

|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격조높은 중저가 호텔이다. 사진은 롯데호텔이 2009년 4월 서울 마포에 개관한 중저가 호텔 롯데시티호텔.> |
모든 산업의 근간은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 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상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관광상품은 크게 잘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등으로 구분한다. 외래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잘거리다. 한국은 외래 관광객의 예산과 성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다양한 요금대의 잘거리가 구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외래 관광객은 국빈급 VVIP 고객부터 상용 출장객, 패키지 이용 관광객, 배낭여행족 등 각자의 여행 목적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맞춤형 잘거리를 필요로 한다. 이는 특급호텔과 1, 2, 3급 호텔 및 레지던스, 콘도, 모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잘거리가 확충돼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유명 대도시의 특급호텔과 비교할 때, 서울은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객실요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이들 호텔들의 객실 수가 턱없이 모자라 객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관계당국이나 일부 여론은 “국내 특급호텔의 객실료가 비싸 외래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다.
현재 외래 관광객이 특급호텔로 몰리는 일종의 ‘쏠림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위 등급(1, 2, 3급 호텔 및 레지던스, 콘도, 모텔 등)의 숙박시설 수준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특급호텔과 하위 등급 숙박 시설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
한국은 특급 밑으로 내려가면 수준이 많이 떨어져 외래객의 경우 여행 목적에 상관없이 특급호텔을 선호한다. 실속파 관광객 중에는 하위 등급 호텔을 예약했다가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에 실망한 나머지 하루 만에 특급호텔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편의시설은 특급호텔 수준이면서 이용료가 절반 정도라면 하위 등급 숙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 좋은 예로 2009년 4월에 개관한 롯데시티호텔 마포를 꼽을 수 있다. 이 호텔은 ‘프리미엄급 비즈니스호텔’을 표방, 중저가 호텔로 문을 열었다. 수영장, 식당, 소회의실 등 특급호텔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구비하는 대신 고비용의 룸 서비스를 없애 인건비를 대폭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호텔의 객실 예약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고객은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다. 낮 동안 업무를 보고 저녁에 잠만 자는 비즈니스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자는 차별화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국내 중소형 호텔의 경우 이 같은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을 유치한다면 특급호텔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이 불가피한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호텔 산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와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큰 반면 환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신설이건 증설이건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해 준다면 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작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특급호텔에 한식당이 없는 이유
잘거리 다음의 고민은 먹을거리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특급호텔에 가면 한식당을 찾기 어렵다. 롯데호텔과 워커힐 호텔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급호텔들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 기존의 한식당을 폐점하거나 아예 개설조차 하지 않은 까닭이다.
호텔에서 한식은 수요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수익성이 떨어진다.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전략 발표 후 최근 들어 “VIP급 해외 고객이 많이 묵는 특급호텔에 왜 한식당이 없느냐”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지만, 호텔 입장에서는 섣불리 한식당을 복원하거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다.
호텔 이미지에 걸맞은 한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식자재는 물론 서비스도 최고급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맞지 않는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정부가 한식당을 이용하는 외래객에 한해 부가세 10%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면 특급호텔도 ‘한식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라별 主食 개발도 중요
‘한식의 세계화’ 못지않게 각 나라별 主食(주식)을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 호텔을 찾는 중국 고객 중에는 “한국에 오면 음식 때문에 고생한다”거나 “한국에 오면 삼계탕 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드라마 <대장금> 덕분에 한식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기름진 음식에 익숙한 이들이 체류 기간 내내 담백한 한식만 먹기는 힘들다. 이미 한국화 된 중국요리 역시 이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국 현지식 레스토랑이 있어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관광객이 자신들의 입맛에 익숙한 自國(자국) 음식을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빠듯한 관광 일정을 소화하다 虛飢(허기)에 지치면 당장 입맛을 자극하는 자국 음식이 그립기 때문이다. ‘한식의 세계화’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한국을 많이 찾는 주요국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發(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웃한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이 서구 유럽이나 동남아보다 경제적으로 실속 있고 치안이 잘돼 있는 한국을 선택한 덕분이다. 특히 일본 관광객은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는데다 주말을 이용해 다녀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문화 유적 답사보다는 도심에 머물며 미용과 쇼핑에 많은 돈을 쓴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위해서는 사시사철 새로운 볼거리로 넘쳐나는 ‘뷰티풀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가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분석해 만족감을 극대화할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인에게 도고 온천이, 중국인에게 금강산이 큰 감흥을 줄 수는 없다.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산업에 산재하는 각종 협회나 민간단체의 맨 파워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신설을 검토했으면 한다. 국내에는 정부를 비롯해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관광 관련 조직이 많다. 일부 경제인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3~4개의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 논의되는 현안이나 사업계획이 서로 중복되는 일이 잦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줄이고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화된 전문기관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다. 일본이 지난해 관광청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광산업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외국인 객실료 부과세 면제 유지돼야
둘째, ‘2010~2012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 관광객 1000만 유치를 목표로 정부나 관광 관련 단체 및 여행업계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시행 예정인 10% 부가세 부과의 환원조치는 ‘한국방문의 해’ 시작 원년에 찬물을 끼얹는 역주행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투숙 외국인의 객실료에 한해 10% 부가세를 면세해 준 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래 관광객 유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10% 부가세 면세 정책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도모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투자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과 같은 이점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가령 롯데호텔은 특1급 호텔 중 ‘한식 세계화’를 위해 가장 열정적으로 사업을 꾀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호텔이 보유한 한식당을 고층으로 옮기고 인테리어와 서비스를 한층 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새롭게 한식당을 개설하거나 기존 한식당을 확대 개편하는 특급호텔의 경우 정부가 투자자금에 대한 저리융자와 세제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기업은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점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상호 무비자 입국 협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물론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호텔 등 관광서비스 업계에 필요한 특정 외국 인력 채용에 대한 노동비자도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한다. 무조건 내국인만 채용하라고 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보며, 이것 또한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
GDP 4만 달러 시대의 견인차 금융산업
한국판 ‘노무라증권’, ‘바클레이즈’ 육성해야
⊙ LG, 현대차, SK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업이 GDP 2만 달러 시대 열었다면,
4만 달러 시대는 글로벌 금융기업의 탄생이 필수
朴焌鉉 삼성증권 사장
⊙ 1953년 인천 출생.
⊙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졸업. 同 대학원 법학석사.
⊙ 삼성생명 기획실장, 자산P/F그룹장(전무), 자산운용BU장(부사장) 역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자.
“명문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둘이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한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직원은 자신들 포함 총 3명이며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계획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기술조차 최초가 아닐뿐더러, 이 분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해 현재도 수많은 기업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레드 오션이라고 한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면 이 학생들이 투자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들은 투자자를 모으는 데 성공했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IT회사를 만드는 기적을 창출했다. 바로 10년 전 투자 유치에 성공해 현재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보다 두 배나 큰 ‘구글’을 만든 미국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라는 청년 사업가 이야기다.
미국의 눈부신 발전의 토대에는 개척시대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유럽 등지에서 모아줄 수 있었던 JP모건과 같은 투자은행의 존재와,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모험 기업이 태동해 성장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자본시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자.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상장한 기업은 어디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기업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중국공상은행(ICBC)이다. 중국공상은행은 2006년 219억 달러라는 엄청난 기업공개(IPO)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세계 자본시장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천명한 지 30년, 상하이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지 채 20년 만에 중국이 이루어낸 작품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자본시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게 해 주는 단적인 사례다. GDP 4만 달러는 일본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인당 GDP 4만 달러의 산업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글로벌 기업의 30% 금융기관이 차지
GDP 2만 달러 시대를 삼성전자, LG, 현대차, SK 등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 기업(2007년 글로벌 100대 기업)들이 열었다면, 4만 달러 시대는 글로벌 금융기업의 탄생이 필수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약 30% 이상을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매출이나 순이익 기준 어느 것으로 보아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글로벌 100대 기업에 들어간 금융기관은 29개社(사)로 이 중 26개사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는 국가들의 금융기관이다. 더욱이 금융산업은 순이익 측면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 전체 순이익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부실자산을 헐값에 인수한 후 비싸게 재매각하는 사례를 보고 ‘먹튀’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대우건설 인수 후보에 오른 사모펀드 자금이 투기자금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왜 우리 토종자본은 인수할 능력이 없어서 외국기업들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자본시장에선 24시간 쉬지 않고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먼브러더스가 쓰러진 자리를 일본의 노무라증권과 영국의 바클레이즈가 대신하면서 차근차근 과실을 수확하고 있다.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노무라증권은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 글로벌 플레이어 진입이라는 평생의 숙원사업을 이번 리먼브러더스의 유럽과 아시아지역 본부를 인수하면서 기회를 얻게 됐고, 바클레이즈는 리먼브러더스 북미지역본부를 인수해 미국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본사건물에 자사 로고를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 풀 꺾이고 난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국 자본시장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이미 공상은행 기업공개를 통해 저력을 확인한 바 있지만, 2009년에는 특히 한국의 코스닥과 유사한 차스닥 시장을 개설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 기업 육성 전략을 공고히 한 바 있으며, 2009년 신규상장 규모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엔젤 투자자들이 ‘구글’ 키워내
구글이 10년 전 벤처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에 실패했다면 세계 최대의 인터넷 회사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당시 구글에 대한 투자자는 누구였는가? 이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없는 모험 기업들에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진 ‘엔젤 투자자’들이다.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은 광대한 자본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자본시장을 통해 리스크 수용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었다.
구글의 경우 엔젤 투자를 받은 5년 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안겨줬다. 엔젤 투자자나 창업자를 제외하고도 직원들 중에서도 수많은 억만장자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다시 모험 기업에 투자자금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을 거치면서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게 된다.
모험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제공되는 환경하에서는 엔젤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부족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자본시장의 선순환적 특성을 꿰뚫고 자본시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시장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IT 육성이 검증된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충만했던 경험이 있다. 지난 IT붐 시절에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NHN 등 1세대 IT벤처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에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금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 신뢰가 무너진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을 기업가와 투자자 그리고 시장참여자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녹색성장을 보자. 녹색성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 新(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야로, 과거 인터넷 혁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구글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기술만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산업, 아이디어는 좋지만 투자 회수는 의문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우선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선뜻 녹색기업에 투자하기 힘들 것이다.
녹색성장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라 해도 GDP 4만 달러 시대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지 못하고선 달성할 수 없다. 그 발판이 되는 것이 건강한 자본시장이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가능성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은 제한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금융 본래의 기능 외에도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금융의 수출은 자본과 금융 노하우 등을 통해 해외투자와 해외 금융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으로,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 등 금융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이다.
그러나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난다는 금융위기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잔뜩 위축돼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제금융의 중심이 빠르게 아시아로 바뀌면서 향후 2020년까지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3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아시아에서의 톱이 글로벌 톱’이라는 등식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금융시장은 아시아적 가치관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사들이 쉽게 공략하지 못해 온 시장이다. 가족과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Neo Asian Value)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금융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첫머리에 소개했던 구글의 초기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초기 투자자 중 하나였던 앤디 벡톨샤임의 경우 총 20만 달러를 투자해 나스닥 상장 이후 1500배가 넘는 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금융산업으로 4만 달러 돌파작전
사모펀드 육성, 해외 M&A, 해외 금융업 진출이 키워드
⊙ 간접투자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업 경쟁력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
⊙ 미국에서 규제 死角지대에 놓였던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감독기구의 규제를 받도록
조치해 금융 위기 모면
尹暢賢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1960년 충북 청주 출생.
⊙ 서울대 물리학과·경제학과 졸업, 同 대학원 경제학 석사, 美 시카고大 경제학 박사(국제금융,
파생금융 전공)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역임. 現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핵폭탄처럼 全(전) 세계를 휩쓸었다. 일시에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자금흐름에 이상이 생기자 실물경제가 한꺼번에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3분기 GDP가 248조원에 달했는데 위기가 본격화된 4분기의 GDP 수준은 235조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13조원, 즉 5.2% 하락이라는 초유의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이 잘못되는 순간 실물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됐고, 이는 금융과 실물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위기 이전과 위기 이후 세계 금융의 심장인 월가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그 모습을 대조해 보면 최근 위기의 영향과 아울러 금융분야의 나아갈 바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첫째, 금융분야에서 리스크관리 강화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회사 내에서 리스크 관리 담당자의 위상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 트레이더들은 자꾸 더 많은 거래를 원하지만, 리스크 관리 부서에 거래승인이나 거래한도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둘째, 파생상품 관련 비즈니스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 특히 주택담보부 증권부문은 예외없이 규모가 줄었다. 파생상품과 일반금융상품을 결합해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분야를 구조화금융이라고 한다. 과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쪽 비즈니스가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경우도 있고, 존재하더라도 인력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매우 큰 차입을 요구하는 대형 인수합병 거래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 레버리지, 곧 남의 돈을 전제로 진행되던 사업이 멈추고 이 과정에서 거래의 계약 등 법적 측면을 담당하던 로펌들마저 타격을 입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매매 등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전통적인 영업부문에서의 성과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는 소식이다.
넷째, 예금에 기초해 대출로 이를 운용하는 전통적 간접금융 내지는 상업은행업이 직접금융, 곧 금융시장을 통한 금융상품거래에 의존하는 투자은행업보다 유리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 주도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은행(FRB)의 감독권한 강화와 함께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를 신설,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시 감독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영국과 EU 등도 자체적인 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이 일고 있다.
여섯째, G20을 중심으로 IMF, FSB(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주축이 돼 신용평가사에 대한 개혁,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재점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 체계,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돼 가시적인 결과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논의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국내적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된 이들 과제에 대해 우리도 국제 공조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이 200㎞로 달릴 때 한국은 50㎞로 달려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더구나 금융산업이 위기의 主犯(주범)으로 몰리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거래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금융이 전체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게 적정하게 성장하면서 실물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것이 여유 있는 계층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재테크적 속성이라고 할 때 자산관리업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위기국면에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 정도가 약하고 직접금융의 발달이 미약했던 것이 오히려 호재가 된 측면도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시속 200㎞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면, 우리는 50㎞로 달리고 있었기에 사고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을 겪은 것이다.
실물경제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시장중심 금융 내지 직접금융이 중요하며,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는 금융시장 육성과 금융투자업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 위기 이후 국면에서 본격화될 새로운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자산운용분야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펀드 자본주의’라 불릴 정도로 자금이 직접금융과 펀드상품으로 몰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축과 함께 부각되기 시작한 투자 붐은 언제든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 간접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 많은 인력이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산업의 육성이 계속돼야 한다. 소수 개인들의 자금을 모은 후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이 이번 위기로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력 있는 헤지펀드들은 계속 생존하면서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통제해 외부불경제를 창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펀드관리가 이뤄지는 사모펀드산업 육성은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 경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나 헤지펀드 등 다양한 사모펀드를 계속 키워가야 할 것이다.
넷째, 위기국면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인수합병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특히 위기국면에서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많아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시장과 기술의 확보를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과 함께 우리 기업이나 펀드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KOTRA) 같은 조직이 해외에 인수 가능한 매물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특히 동남아 진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성장궤도에 진입할 경우 개도국들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전제로 개도국의 금융산업에 미리 진출해 길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통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이 유리했던 측면도 있다. 미국에서 사실상 규제의 死角(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우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법에 지정돼 자율규제기관과 감독기구의 명시적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다행히 국내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산업이 4만 달러 선도
이제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해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경우 과거보다는 강화된 수준이지만 현재보다는 완화된 새로운 영업모형들이 금융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움켜쥐는 자세가 중요하다.
4만 달러 시대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금융산업의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기존의 상업은행업과 함께 레버리지를 줄인 건실한 형태의 투자은행업을 중심으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조화, 실물과 금융의 조화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옮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대비와 변신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은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산업으로 변신할 것이다.★
우주항공산업을 통한 4만 달러 전략
소형 위성사업 분야 한국이 강점
⊙ 우주 관련기술은 신소재, 초고속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의 母胎
⊙ 2008년 세계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1444억 달러로, 연평균 17.7% 증가
李柱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1952년 서울 출생.
⊙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존스홉킨스대 기계공학 박사.
⊙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목적위성사업단장·위성정보연구소장 역임

러시아의 천문학자인 니콜라이 카르다세프는 인류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명의 기술 발달 단계를 타입(Type) 1, 2, 3의 3단계로 분류했다. 타입1은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같은 지구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단계, 타입2는 태양에너지와 행성자원 등의 태양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 타입3은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가 제안한 척도에 따르면 현재의 문명은 지구 에너지의 일부만 활용하는 단계, 즉 타입1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타입0’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서서히 이동해 온 문명의 단계에 머지않아 급속한 변화가 있으리란 예상을 한다. 그동안 구상단계에 머물렀던 태양계 에너지 이용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 대기권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이곳에서 확보한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는 우주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래 에너지원인 ‘헬륨3’나 티타늄, 철, 알루미늄 같은 자원들을 달에서 채취하기 위한 달 착륙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혜성이나 소행성에 존재하는 엄청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태양계 탐사도 추진 중이다.
이런 시도들이 현실화되면 인류의 에너지 사용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인류 문명의 기술 발달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주개발 경쟁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우주경쟁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新(신)우주개발 경쟁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우주기술은 99.9999%(six nine)의 신뢰도를 목표로 하는 무결점 기술이다. 우주는 극저온, 고진공, 무중력, 고준위 방사선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처럼 지구와는 다른 극한 우주환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주에서 쓰일 제품들은 신뢰성을 높이는 시험을 수없이 거쳐 선택되고, 이런 특성 때문에 현재 인간이 만든 공업제품 중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지고 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일반 나사라도 일반 상용제품이 10원이라면 軍用(군용)으로 쓰이는 밀리터리급은 100원, 인공위성에 쓰이는 우주용은 1000원 정도다. 수십만 개의 부품 중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인된 高價(고가)의 제품을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셈이다.
‘아폴로 계획’이 거둔 과학적 성과
제품 단위별 가격도 중량 1t당 자동차 가격이 3만 달러인 데 비해 통신위성의 가격은 1억 달러로 자동차의 약 3000배에 이른다.
이처럼 우주기술은 여러 면에서 한 차원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기술적 인프라를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주기술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상징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1960년대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라는 외형적 의미를 넘어 인류가 수십 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과학적 성과들을 단기간에 이루어 냈다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당시 인간을 달에 보내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새로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됐고, 무려 39만명의 과학자가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1961년부터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신소재, 초고속 컴퓨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기계, 소재, 전자, 통신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을 아우르는 최첨단 시스템 종합기술인 우주기술은 관련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료, 자동차, 통신, 의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파급되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GPS라 불리는 위성항법 수신기다. 본래 GPS는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민간 분야에 활용되면서 그 쓰임새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비행기에는 GPS를 이용한 항법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바다를 항해할 때도 뱃길과 조업 위치를 확인하는 필수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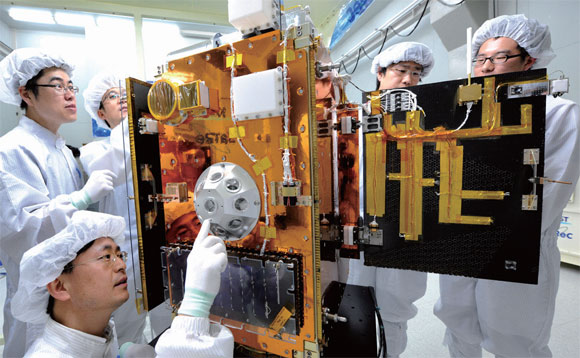 |
| 대전 유성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들이 나로호에 실린 과학기술위성 2호를 점검하고 있다. |
우주기술은 미래산업의 원천
CT, MRI, 라식 수술기와 같은 의료기기, 골프채와 같은 스포츠 용품, 고어텍스와 같은 의류에도 우주기술이 숨어 있다. 여성 속옷에 사용되는 메모리 몰드, 깎은 수염이 전기면도기 안에 모이도록 하는 남성 전기면도기의 로터리 시스템도 우주기술에서 나온 것이다. 우주선에 사용했던 진공 기술은 반도체 산업을 탄생시켰고, 연료전지를 처음 사용한 것도 우주선이었다.
이처럼 우주개발 과정에서 나온 신기술들은 첨단 의료기술과 다양한 신소재 제품에 응용되고 있으며, 우주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우주 환경을 이용한 신소재나 신의약품 개발은 미래 산업의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세계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1444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우주 분야를 국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30~40년 정도 늦은 1990년 초반 우주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15년 만에 아리랑위성 2호 개발로 1m급 고해상도 카메라 기술을 확보해 세계 6〜7위권의 고정밀 위성국으로 올라섰고, 나로우주센터 건립과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독자적인 우주개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우주기술 자립도는 낮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여전하며, 민간의 우주사업 참여와 우주개발 성과의 활용도 미흡하다. 이제 선진국을 따라가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한 우주개발 사업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주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우주가 1인당 GDP 4만 달러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나로호 발사에서 기술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21년에는 달 궤도선, 2025년에는 달 착륙선을 발사해 세계 7위의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 우주개발 추세를 눈여겨볼 때 우주기술의 산업화도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우주산업을 정부의 투자 없이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주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도 전체 우주산업 매출의 90% 정도를 정부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주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과학기술위성과 같이 저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소형 위성의 경우 선진국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짧은 우주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과를 거둔 데에는 젓가락 문화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 ‘평균 IQ 107’ 정도로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우수한 두뇌, 높은 학구열, 그리고 우리 국민 특유의 억척과 자긍심 또한 우주기술 개발에 적합한 국민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적 특성을 살려 장기적인 국가 우주개발 발전전략을 세워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개발을 선도하고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가능성
3차산업 비중 높이고, 항공우주산업에 올인해야
⊙ GDP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도약하는 데 대략 13년 걸려
⊙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지속성장을 통해 7~8년 만에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뛰어올라
李鍾熙 대한항공 대표이사 총괄사장
⊙ 1942년 대구 출생.
⊙ 대구상고,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 서경대 경영대학원 박사.
⊙ 대한항공 서울여객지점장, 여객사업본부 사장 역임. 現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
1인당국민소득(GDP)은 선진국 진입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보는 선진 경제국가 32개국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보는 선진 경제클럽 24개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GDP 3만 달러 고소득 28개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GDP 3만 달러도 아니고 4만 달러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는가? 이는 아래와 같은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존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대략 13년이 소요됐다. 대표적인 서비스산업 국가인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지속성장을 통해 7~8년 만에 GDP 4만 달러를 달성한 반면 노르웨이, 미국처럼 후퇴와 재진입의 반복으로 달성기간이 길어진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성장 둔화와 원화가치 하락으로 2009년엔 2006년도 수준인 1만7000달러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GDP를 고려할 때, 수년 내 GDP 4만 달러는 요원한 목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확인된 저력과 강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같은 모델을 접목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된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들은 3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7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0%다. 3차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고, 굴뚝이 필요 없는 무공해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형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다. 룩셈부르크나 스위스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빠른 GDP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항공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세계 10번째 우주발사국이라는 역사적 발판을 마련했다. 서비스 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이 두 가지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GDP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적 전략산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비스업 비중 높여야
공교롭게도 필자는 이 두 가지 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해 오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 두 가지 산업의 GDP 4만 달러 견인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규모도 미약하지만, 무엇보다 질적인 선진화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 개선 없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늘린다면, 자칫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서비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은 반드시 질적 성장의 토대 위에서 양적으로 성장돼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개별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만 구축하면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우수한 서비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이나 통신과 같은 분야는 차별화된 고도의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에서는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서비스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이다. 관광산업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관광수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규모 13억의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과 인접해 있어서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지금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 중 관광상품의 브랜드화는 국가 브랜드의 기본이자 필수요소다.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기에 국민 모두의 친절과 미소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GDP 4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國無常强 無常弱(국무상강 무상약)’
얼마 전까지 TV에서 볼 수 있던 대한항공의 광고 카피다. 처음부터 강한 나라로 시작한 나라도 없고, 강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이르면 2~3년 내에 신흥 富國(부국)인 중국이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망도 있다.

항공우주산업의 가능성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산업들이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에 경쟁력을 빼앗기는 상황에 대비해 과감하게 전략산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산업과 최첨단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 컨설팅, IT 등 지식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IT산업을 제외한 금융, 컨설팅 등 타 지식산업의 경우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갖추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첨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중인 최첨단 산업 중 하나가 항공우주개발 분야다. 항공우주산업은 국가방위의 근간이 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반도체·자동차산업처럼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선진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항공우주 분야는 전후방 연관산업을 수반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항공우주 분야에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제공호’를 생산한 대한항공을 비롯한 소수의 업체가 진출해 있다.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항공우주 관련 역량이 통합돼야 한다. 또 무인기 개발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의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이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성장 배후에는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해 온 초우량 기업들이 있다. 경제강국이란 글로벌 기업의 수가 많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1인당 GDP 2만 달러 가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대한항공과 같은 국내 유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수많은 기업이 오래전부터 ‘세계화’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세계화에 성공한 기업은 손꼽을 정도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시장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 정책, 조직 문화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전 세계 사람과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해야 하므로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뿐만 아니라 현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시장공략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현지화(Localization)전략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을 지속하는 등 현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지인들의 가슴에 다가가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글로벌 서비스 기업인 대한항공도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오늘날 각국 정부들은 개별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고용 창출과 國富(국부) 증대로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과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기술·금융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0년에 반드시 2만 달러에 재진입해야 한다. 나아가 산업구조를 선진화함으로써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2010년에는 세계 경제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동안의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에서, GDP 4만 달러 시대를 얼마나 빨리 실현하는가는 전략적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
新성장동력, 녹색산업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107조원 투입
⊙ 세계은행,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2007년 640억 달러에서 2010년 1500억 달러로 확대 예상
⊙ 우리 정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발표
都建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1971년 대구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同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감사원 부감사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미국 밴더빌트大
초빙연구원, 고려대 연구교수, 한국정부조달연구원 부원장 역임.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육성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해 왔으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가파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둔화의 원인은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에 의존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는 내연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쟁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8년 8월 15일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미국發(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쇠퇴해 가는 국가 경쟁력을 녹색산업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녹색은 새로운 성장의 키워드로 전환되고 있다.
2008년 7월 영국의 신경제재단(NEF)은 <그린 뉴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가 금융위기,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등 3重苦(중고)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탄소세 도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2008년 10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녹색산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분야로 자원 재활용을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및 청정기술,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유기농업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방지사업, 도시계획, 교통, 親(친)환경빌딩 등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등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했고 부처별로도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월 13일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제시한 3대 분야 17개 新(신)성장동력에 6개의 녹색기술 산업을 포함시켰다.
또 정부는 2009년 7월 향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 총 10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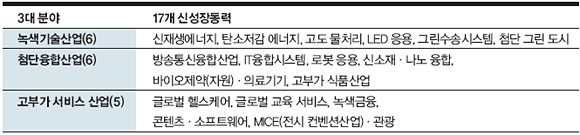
환경규제 무역 장벽으로 등장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환경 관련 규제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U(유럽연합)는 이미 연간 1t 이상 제조되거나 域內(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와 ‘EuP(Energy-using Products) 대기전력 규제안’과 같이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7년 EU 의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140g/km(2008년)에서 125g/km(2015년 이후)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환경규제를 통해 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 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해 글로벌 녹색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2009년 6월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조정조치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경조정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2010년 중에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정책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이들 국가가 녹색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제도 시행에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多(다)배출 기업, 에너지 저효율 제품, 환경에 危害(위해)한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즉 환경 관련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전체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인 한국의 경우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2007년 64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도 2007년 773억 달러에서 2017년 2545억 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도 향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갈수록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선도시장 창출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의 창출을 통해 선도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國力(국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선도시장은 ‘기술과 규제의 표준화가 중요한 시장’으로서 일단 표준이 설정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후발주자의 수익창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범국가적으로 녹색산업을 新(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녹색산업 분야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되, 법·제도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특히 초기의 녹색시장은 정부 규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법·제도 등 인프라 정비와 구축이 중요하다.
이미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외에도 배출권거래소 신설, 녹색산업에 대한 稅制(세제)지원, 녹색금융,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녹색성장을 위한 R&D와 사업화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산업계 및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 조직인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와 같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추진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부문만을 육성하기보다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풍력발전기 분야에서 터빈, 기어박스, 제품설계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육성시킨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으나, 특정 부품만을 수출했던 핀란드, 스웨덴 등은 시장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협소한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내수시장을 차세대 기술의 시험장(Test bed)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녹색 마케팅이 필요
기업 차원에서는 현재 강점을 지닌 IT 등의 기술을 활용해 융·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출산업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재 주력 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업종은 태양전지, 화학은 태양광 소재, 기계 및 철강은 풍력발전기, 조선은 해상풍력 장치, 자동차 및 에너지 업종은 수소연료전지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통해 환경에 관심이 커진 소비자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며, 탄소성적표지(제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편집자 주) 등 친환경 상품에 대한 각종 인증을 획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농업 선진국의 가능성
쌀 농가를 축산·화훼·채소·과실 농가로 전환해야
⊙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20대 경제대국 중 꼴찌지만 농업 생산액은 네덜란드의 두 배이며 캐나다,
호주,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
⊙ 한국의 농경지 1ha(1만㎡)당 생산액 1만4600달러로 1만4700달러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
李泰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1955년 서울 출생.
⊙ 경기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아이오와 주립대 농업경제학
박사.
⊙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학부장 역임.
⊙ 現 한국농업경제학회 부회장.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 땅을 이용하는 농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업은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 20대 경제대국의 농업을 비교해 보면 한국농업은 14위 정도의 농업생산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GDP 세계 12위 국가의 수준에 걸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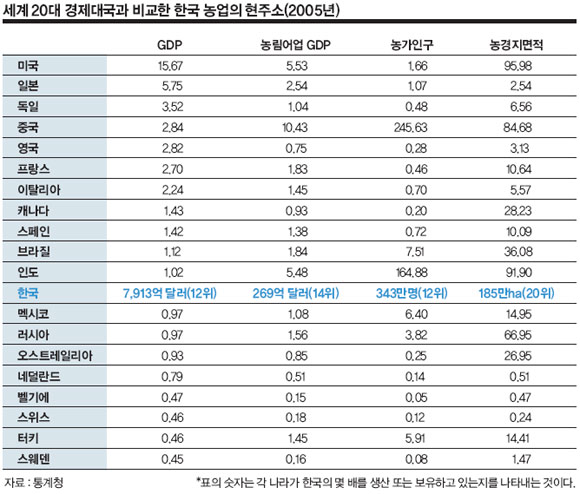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20대 경제대국 중 꼴찌지만 농업 생산액은 네덜란드의 두 배이며 캐나다, 호주,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농경지 1ha(1만㎡)당 생산액이 무려 1만4600달러로 1만4700달러인 네덜란드에 이어 2위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농업에 만족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한국의 농지 생산성이 이렇게 높으므로 독자들은 한국이 원예, 축산과 같은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농민의 대부분은 쌀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의 농지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우리 농업인이 근면하고 창의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의해 쌀값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좁은 땅에서 국민을 부양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거국적으로 식량농업, 특히 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의 세계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식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지금, 식량으로서 쌀의 중요성은 현저히 감소했다. 특히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쌀 농업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 농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현재 우리 쌀 농가의 수는 65만 호에 이른다. 반면 채소 농가는 23만 호, 과수 농가는 15만 호, 밭작물 농가는 13만 호, 축산 농가는 8만 호, 특용작물은 3만 호, 화훼 농가는 1만 호 정도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소득 순위가 중간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00만원 정도다.
농가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정도 되려면 적어도 연간 판매액이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쌀농사로 판매액을 5000만원 이상 올리려면 5ha(5만㎡)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60%의 쌀 농가가 1ha 미만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쌀 농업은 거의 100% 기계화되어 있어 한 농가가 10ha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논 면적이 90만ha 정도이니 능력 있는 쌀 농가가 9만 호만 있으면 쌀농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이다. 9만 호가 지어도 되는 농사를 무려 65만 호가 짓고 있으니 토지 생산성은 최고 수준일지 모르지만 노동 생산성이 낮고, 자연히 농업인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쌀’이 아닌 다른 분야로 눈 돌려라

2005년 농업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간 판매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농가의 비중은 축산이 11%, 화훼가 8%, 특용작물이 3%, 채소와 과수가 각각 1%, 쌀 농가는 0.3%에 그친다. 특히 쌀의 경우 판매액이 없는 농가가 10%가 넘고, 약 75%(50만 호) 농가의 판매액이 1000만원이 안된다.
쌀에 주력하는 우리 농가 인구의 1인당 연간 생산액은 약 7800달러로 20대 경제대국 중 14위이다. 쌀의 자급이 달성된 이상 쌀이 아닌 다른 작물에 눈을 돌려야 한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예를 보자. 이들 국가의 농업은 역경의 산물이다. 농지는 비좁고 토양은 척박했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닭들을 먹이는 데도 모자란다”고 빈정댔다. 좁은 농지에서 집약적인 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이들 국가의 노력과, 일찍이 무역으로 다져진 상업제도는 상업농을 발생시켰다.
16세기 후반에 벌써 이들의 농업은 유럽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손꼽혔다. 가축을 잘 먹여 암소는 많은 젖을 생산하게 됐고, 원예농업이 발달했으며, 도시의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다. 농업의 고품질화와 시장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됐고 노동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7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이 “농업 노동자의 임금이 하도 높아서 농장주보다 잘산다”고 투덜댈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민의 자본주의 정신은 농업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확실하다. 이미 상당히 높은 토지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인당 생산면적을 넓혀 주거나, 같은 면적에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쌀처럼 면적당 생산을 높이기 어려운 소위 토지 이용형 작물은 논의 임대차를 활성화시켜 농가당 경작 면적을 늘려 주어야 한다.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등과 같이 땅이 많이 필요 없는 작물은 땅값이 비싼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이다. 품질을 세계 수준으로 고급화하여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좁은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어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등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농가 경영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농가가 60%인 실정에서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농가당 논 면적을 넓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쌀 농가의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젊은 농촌’ 프로젝트
65만 쌀 농가를 4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 약 50만 호의 농가가 농업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쌀 농가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액 1000만원이 안되는 소위 ‘한계 농가’부터 쌀농사를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농촌에 살지만 대부분의 소득은 농업 이외의 부문에서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농업 소득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웬만한 농업정책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이유도 자가 식량 조달부터 취미 활동까지 다양하다. 이들 영세농은 또 高齡農(고령농)인 경우가 많다. 영세 고령농을 어찌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진 농업국으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고령화 문제와(물론 고령 농민 중에도 젊은이보다 더 의욕적으로 훌륭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이 많이 있다) 규모화를 가로막는 영세농 문제로 압축된다. 이들 중 더욱 중요한 것은 고령화된 농업을 젊게 하는 것이다. 나이가 젊은 농업인이라야 의욕적으로 새로운 농법도 도입하고 규모화도 추진할 수 있다. 젊은이가 농사를 짓게 하려면 물질적인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이 도전해 볼 만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사실 IT 농업, BT 농업, 유기농업, 농산물 유통 등 우리 농업에는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만한 기술집약적인 분야가 많이 있다. 이와 같은 분야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도록 하려면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성급한 지원 정책은 보조금을 바라고 농사를 짓는, 껍데기만 젊은 농업인을 양산하기 쉽다. 피카소의 말처럼 ‘젊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영화산업을 통한 4만 달러 달성 작전
머천다이징 프로젝트, 해외영화 공동제작
⊙ 완구, 피규어, 컴퓨터 게임, 테마 파크 등의 사업 동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 <로봇태권V>
⊙ CJ엔터테인먼트 할리우드 영화 <어거스트 러쉬> 제작에 15억원 투자해 35억원 벌어들여
吳東振 D&D미디어 대표
⊙ 1964년 서울 출생.
⊙ 고려대 사학과 졸업.
⊙ 문화일보, 연합뉴스, YTN 문화부 기자·취재부장·편집위원, <씨네버스> 편집장 역임.
⊙ 現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프리미어> 편집위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국내 영화계가 해야 할 일은 영화산 업의 패러다임, 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영화계는 오로지 ‘영화’라는 메인 상품 하나만에 매달려 왔다. 영화로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파생상품을 만들어 부가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순서를 뒤바꿔야 한다.
다소 뒤늦은 얘기지만 2007년에 개봉했던 <디워> 같은 작품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디워>의 국내 제작비는 약 300억원 수준이었다. 국내 제작환경으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지만 다행히 1000만 관객을 모아 수익은 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한국영화로서는 처음으로 2000개가 훨씬 넘는 스크린에서 개봉을 했다.
이 과정에서 100억원이 넘는 광고 마케팅 관련 비용이 들어갔지만 300억원 정도의 DVD 판매 수익으로 보충하고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에 대한 미학적 평가야 어찌 됐든 사업적 측면에서 <디워>는 밑진 장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보다 정교하게 접근했으면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둬들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디워>를 전체 콘텐츠 사업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하고 사전에 각종 머천다이징 상품을 개발한 후 영화 개봉을 전후해 판매 사업을 진행시켰다면 얘기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중견 제작자 신철씨가 10년 가까이 추진 중인 ‘<로봇태권V> 프로젝트’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겨냥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로봇태권V>는 1976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오래된 만화영화 콘텐츠가 과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일까.
신철 제작자도 처음에는 3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 맞게 예전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액션 피규어(영화·만화·게임 등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축소해 거의 완벽한 형태로 재현한 인형-편집자 주)를 만들게 됐다.
그 과정에서 국내 완구업체 가운데 로봇태권V와 관련된 상품을 만든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두 일본 완구업체인 반다이 코리아의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것. 이는 곧 국내 영상산업이 이른바 ‘머천다이징 프로젝트’를 올바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한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길 개척
한 편의 영화를 만들거나 영상물을 만들 때 이미 그 영화나 영상물은 수많은 머천다이징 프로덕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일단 영화나 영상물을 만든 후에야 관련 부가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가 다 잊힐 때쯤이면 관련 상품이 나온다 한들 별 효과가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신철 제작자가 추진 중인 ‘로봇태권V 프로젝트’는 그 같은 상황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영화 <로봇태권V>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로 제작 중이며 <세븐 데이즈>를 만들었던 원신연 감독이 연출을 맡을 예정이다. 현재 시나리오가 완성된 단계다. 신철 제작자는 영화 제작 이전에 각종의 액션 피규어 출시를 비롯해 출판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의 복원, 심지어 로봇태권V 카페까지 오픈한 상태다.
할리우드 영화 <트랜스포머>나 <스파이더맨>을 생각하면 로봇태권V 프로젝트가 다가서려고 하는 목표지점이 보인다. <트랜스포머>는 영화로는 20억 달러를 벌었지만 완구만 전 세계 시장에서 4000만 개를 팔았다. <스파이더맨>은 극장에서는 8억 달러를 벌었지만 캐릭터 상품으로만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애니메이션으로 시작된 ‘로봇태권V 프로젝트’는 ▲실사영화 사업 ▲완구사업 ▲실제 로봇을 만드는 로봇 사업 ▲인천 청라지구에 높이 112m, 30층 규모로 세워질 태권V 탑 등 테마파크 사업 ▲출판만화 사업 ▲로봇전문 방송채널 사업 ▲컴퓨터 게임 등 게임 스튜디오 사업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동시에 기획되고 동시에 진행된다는 데에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영화는 한 분야일 뿐 전체 사업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해 영화계가 또 한 가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외시장이다. 이제는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과 무기가 있다. 사람과 돈이다. 홍콩 영화계의 선례가 있듯이 감독과 배우가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첩혈쌍웅>의 오우삼이 그랬고, 그의 페르소나였던 주윤발이 그랬다. <무간도>의 유위강 감독은 리처드 기어를 기용해 <트랩>이라는 영화를 찍기도 했다.
한국의 배우와 감독도 요즘 할리우드를 포함해 해외 영화계의 문을 자주 두드린다. 가장 대표적인 배우가 바로 가수 비일 것이다. 그는 <스피드 레이서>에 이어 <닌자 어쌔신>으로 할리우드의 새별이 됐다. 세계적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박찬욱 감독도 곧 할리우드行(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도 미국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만 나가는 것은 시장에 주는 효과 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될 확률이 높다. 해외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돈, 자본이다. 무조건 큰돈을 써야 하느냐. 그건 꼭 그렇지가 않다. 영리한 자본 게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내 메이저 배급사 가운데 하나인 CJ엔터테인먼트의 행보가 주목된다.
CJ엔터테인먼트의 성공 모델
지난 2007년 말 국내 극장가에 혜성처럼 등장해 개봉 2주 만에 전국 1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있었다. 바로 <어거스트 러쉬>가 그것이다. 이 영화의 외피는 미국의 메이저 워너브러더스였지만 내용물은 한국의 CJ엔터테인먼트가 채운 작품이다. CJ가 일부 투자를 한 작품이라는 얘기다.
<어거스트 러쉬>는 전 세계 영화사들로부터 십시일반, 제작비를 모아 아일랜드 커스틴 쉐리단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배급권 역시 각 나라의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이 영화의 한국 배급은 당연히 CJ가 맡았다.
이 영화에 150만 달러를 투자한 CJ는 개봉 2주 만에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했다. 100만 관객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억원이며 이렇게 되면 극장 대 투자사(배급/제작사)는 각각 35억원씩을 나눠 갖게 된다.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CJ는 당시 15억원을 들여 35억원을 번 셈이다.
<어거스트 러쉬>는 고아로 살아가는 한 천재소년 음악가가 자신이 죽은 줄로 알고 존재조차 모르는 부모를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다. CJ 측에서는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와 성공적으로 ‘몸을 섞은 것’도 섞은 것이지만 그 지분을 활용해 시나리오상에 한국적 정서를 넣을 수 있게 된 것도 국내 흥행에서 성과를 거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영화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이른바 ‘어거스트 러쉬 모델’이 궁극적으로 한국화산업이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만들어진 작품을 들고 나가 세일(sale)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묘책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내 작품을 팔 생각만 한 셈인데 사실 이게 별로 효과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남는 것도 별로 없는 방법이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트 러쉬>는 일대 생각의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작품이다. ‘내 작품’만 팔 생각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남의 작품’을 만들되, 그것도 함께 만드는 방식을 통해 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신 한국이면 한국, 아시아면 아시아라는 식으로 일정 구역의 시장 배급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도 때에 따라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어거스트 러쉬>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난 2년간 CJ는 본격적인 해외진출 및 할리우드 제작 사업에의 참여를 진행해 왔다. 2008년에는 영화 <박쥐>에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인 유니버설 픽처스를 공동 제작 및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2009년 올해에는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3주간 1위를 차지한 로맨틱 코미디 <소피의 연애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일본의 최대 극장 체인 가운데 하나인 ‘티조이’와 공동으로 일본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영화 <해리포터>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의 제작사인 ‘1492 픽처스’와 3년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CJ엔터테인먼트는 향후 3년간 ‘1492 픽처스’ 작품에 대한 공동 기획 및 개발 권리와 함께, 공동 개발 작품의 한국, 일본, 중국 배급 및 투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4만 달러 시대의 패션산업
우리의 모든 삶이 디자인을 입는다
⊙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를 입히려면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고 해체하는 노력 필요
⊙ 우유의 단백질, 코코넛 껍데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 패션에도 관심 가져야 할 때
이상봉 디자이너
⊙ 서울 출생.
⊙ 서울예술대 방송연예과 졸업.
⊙ 일본 오사카 세계 월드패션쇼, 광주 비엔날레 국제미술 의상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참가,

패션산업의 발전 여부는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척도다. 쉬운 예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패션 强國(강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 대열에 있다. 우리나라 패션산업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맥을 같이하며 빠르게 성장해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패션 소비국으로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대부분 만날 수 있고,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은 美洲(미주) 시장보다 규모가 크다.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섬유 수출로 먹고살던 생산 기반 국가에서 소비국으로 그 위치가 바뀐 것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브랜드들과의 경쟁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눈부신 변화다.
패션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가 전통적인 패션 강국들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단 한 가지, 바로 디자인이다. 그들에게는 없는 우리의 고유한 멋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라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다만 그것은 단시간에 가능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가야 한다.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먼저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파리에서 쇼를 하면 1~2시간 뒤에 한국의 지인들로부터 축하 전화가 걸려 온다.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는 큰 의미가 없어졌고,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니 글로벌화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 문화가 국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통이란 일방통행이 아니다. 우리 것을 잃어버리며 남의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다른 문화도 존중하는 자세다. 디자인에도 그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필자는 한글 디자인의 작품을 발표할 때, 그 나라 언어와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를 함께 넣는다. 그래야 모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멋있다고 느낀다.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를 논하기 전에, 우리 것의 존재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찾는 일이 먼저다.
필자가 처음 프랑스에서 한글 티셔츠를 선보일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다. 오히려 우리 글이 아닌 영문으로 된 티셔츠에는 익숙해져 있으면서 정작 한글은 낯설었던 것이다. 그것이 과연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해외 전시를 부추긴 것은 오히려 외국 바이어들이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동 등 다양한 국적의 바이어들이 한결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의 멋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도 그때 얻었다.
전통 계승한 디자인의 산업화가 관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전통 문화는 계승, 발전시켜야 하지만 전통과 산업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2003년에 필자는 샤머니즘이라는 가장 토속적인 테마를 들고 파리컬렉션을 준비한 적이 있다. 컬렉션 당일 프랑스 문화의 심장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에 마련된 쇼장에는 한국에서 공수해 간 솟대들이 세워졌다. 실제 무속인을 데리고 가 진행한 쇼는 언론들로부터 “매우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었지만,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 했다. 문화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였다.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입게 만들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을 과감히 깨뜨리고 해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이 낯선 문화를 접하고 느끼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기함만으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된다.
1997년도에 ‘IMF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파리가 아닌 런던에 먼저 진출하려던 무렵, 당시 인터뷰에서 필자는 한국적인 것으로 승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밝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실루엣은 반드시 서양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가령 유럽에 소개된 지 100년이 넘는 기모노는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그것을 외출복으로 입지 않는다.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한복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입었을 때 거부감이 없고 활동하기 편하면서 이미지는 동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필자는 해외시장을 목표로 할 때는 꼭 한국적인 모티브의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들과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화라는 생각에서였다.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를 어떻게 되살리고, 산업화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패션산업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화두다.
디자인의 경쟁력은 의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실은 넓은 의미의 패션이기 때문이다. 구두, 가방, 의류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동차, 건물까지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런 디자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 이제까지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디자인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993년에는 ‘이상봉 아트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스포츠웨어에서부터 가구, 그릇까지 망라하는 생활 디자인 제품들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는 시기상조였던 탓에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이런 작업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일반화되었다. 필자 역시 그릇, 휴대폰, 아파트, 침구류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디자인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외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디자인에서 영역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떤 영역이든지 디자인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감성들을 ‘우리 것’으로 담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패션산업 성장 좌우할 ‘친환경’
미래 패션산업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안은 바로 ‘환경’이다.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금은 패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라벨에 표기해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탄소 라벨 마케팅’이나 섬유 원산지부터 제품 가봉과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력추진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패션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S/S 시즌에는 우유의 천연단백질에서 추출한 신소재 섬유 속옷이나 코코넛 껍데기를 이용해 냄새 흡수력을 높인 의류, 100% 재생 가능한 식물성 산업 섬유 등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원낭비와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패스트 패션(유행에 따라 재빨리 만들어 내놓는 옷)’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비중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 나온 한 조사결과를 보면 영국인 한 명이 한 해 입고 버리는 옷의 무게가 자그마치 30㎏에 달한다고 한다. 비교적 검소한 생활을 하는 유럽 국가에서 나온 통계치가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다수의 패션 디자이너에게 환경문제는 덮어두고 싶은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이나 친환경 소재와 같은 에코패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디자인, 환경과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글로벌화로 어느 곳에서든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지금은 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재, 부자재 등 생산 전문인력과 시설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나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남아 등지로 옮겨가 고가의 하이패션 정도로만 명맥을 잇고 있는 국내 제조 기반시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高(고)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아예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인터넷 산업을 통한 4만 달러 전략
창출하여 IMF 외환위기 극복에 결정적 기여
韓昌敏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1964년 서울 출생.
⊙ 용문고·연세대 철학과 졸업.
⊙ 조선일보 뉴미디어연구소 전략기획팀장, 한겨레신문 미디어기획팀장, <싸이버저널> 편집인,
딴지일보 편집장 등 역임.
‘2008년 세계 디지털 경제의 사업규모는 3조 유로(약 5400조원)이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6% 정도로, 전체 경제성장률의 약 2배에 가깝다.’(IDATE·유럽의 통신인터넷미디어 조사기관)
대한민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오늘날의 2만 달러 시대를 가능케 했는지 돌이켜 보는 것이 우선이다.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의 관점에서 뒤돌아 보자.
대한민국은 1970년대부터 ICT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컬러 TV, 교환기, 반도체, 컴퓨터 등의 주력분야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국내 최고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1970년대에 전기통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1980년대에는 TDX 개발(1984), 16비트 PC 생산(1984),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1984), 4M DRAM 개발(1988),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87), 유선전화 1000만 회선 돌파(1988) 등 정보통신 자립화 기반을 구축했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던 1990년대 들어서 세계적인 초고속정보통신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출범했다. 세계 최초 CDMA 상용화(1996)를 통해 1998년 이동통신 가입자가 1000만명에 도달했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전 국민 정보화교육이 본격화되는 등 지식정보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전략이 수립됐다.
디지털 新산업의 폭발적 성장

ICT산업의 전체 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4년 21% 수준에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30%대(2004년 최고 36.9% 기록)를 유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ICT산업의 GDP 비중은 1995년 4.0%에서 2007년 16.9%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ICT산업의 수출 경쟁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세계 소비자 평가 등에서 모두 최상위 수준이다. 특히 현시비교우위 지수(RCA·한 나라의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 지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 총 수출액 대비 ICT 수출액을 1.0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ICT수출 RCA는 2006년 2.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국내 ICT산업의 세계 생산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ICT 기기 세계 생산 비중은 1994년 4.3%에서 2005년 7.1%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이동전화 단말기의 급속한 성장으로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부품의 세계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ICT산업은 초고속 인터넷, 반도체, LCD, 이동통신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 오늘날 ICT강국으로 도약했다. 현재 국내 ICT산업은 고성장으로 수출주도 및 상품수지 흑자, 투자확대 등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대표적인 선도산업으로 확고히 정착했다. ICT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창출을 확대함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개선해 온 전략산업이다. 국민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국가 제1의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1998년부터 시작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첨단 ICT기술을 서비스와 콘텐츠에 접목한 포털,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新(신)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00년 559억원이던 4대 포털 매출액이 2006년 1조원을 돌파했고, 2009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인터넷 광고 시장은 2000년 1360억원에서 2007년 8907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09년에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게임도 2000년 1915억원에서 2006년 1조8000억원 시장으로 성장해 규모 측면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는 2000년 58조원에서 2008년 630조원으로 약 11배 성장했다. 인터넷 쇼핑 시장도 2001년 3조3000억원에서 연평균 29.5% 증가, 2007년에는 15조8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06년 인터넷 쇼핑 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181조6000억원의 7.4%를 차지해 미국과 일본의 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디지털 신산업은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가치 외에도, 대한민국 전체의 ‘정보경쟁력 향상’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 계량하거나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가가치까지 지니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고속도로’는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의 상징이다. 제조업이 1만 달러 시대의 핵심동력이었다면 ICT산업과 디지털 신산업은 2만 달러 시대를 이끌어 온 핵심동력이었다.
<디지털 경제(통신, 영상,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성장률은 전체 경제성장률의 2배이며, 전 세계 경제 성장의 25%를 차지한다. 또 5년 안에 30%에 이를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선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 분야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프랑스에서 이 분야의 투자는 미국에 비해서는 2배 정도, 그리고 북유럽이나 일본, 한국 등에 비해서는 3배 정도 작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는 것은 추가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디지털 프랑스 2012>)
有線 한국을 추월하는 無線 선진국들
대한민국이 ‘IT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찬사에 도취해 컨트롤 타워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가 고용을 줄인다’, ‘이공계와 IT를 홀대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주춤하는 사이, 세계 각국은 대한민국을 ICT산업과 디지털 신산업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인당 GDP 4만 달러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2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기 위해 펼쳤던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인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추구’는 대한민국을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自國(자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음을 통감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그는 ‘공공 정책 평가전망 및 디지털 경제개발’ 장관을 신임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의 중장기 액션 플랜을 담은 정책보고서 <디지털 프랑스 2012>를 발간케 했다. ‘디지털 프랑스 2012’ 계획은 朴正熙(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金大中(김대중) 정부의 지식정보화 강국 계획을 합성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라 2012년경에는 휴대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PC를 통한 접속 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2008년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5억5000만명에 달 하며, 2012년에는 15억명을 넘어설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이 바꾸는 산업의 지도>)
우리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디에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할까. 정답은 ‘모바일(무선) 인터넷’이다. 우리가 유선 인터넷에서 앞서 가는 동안 무선 인터넷에서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우리가 일본과 싱가포르, 미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일본에서 무선 인터넷은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다. 일본의 무선 인터넷 이용자는 약 90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를 훌쩍 넘은 상태다. 일본 어디를 가나 휴대전화를 들고 인터넷을 하거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선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구매하면 제일 먼저 비싼 요금이 무서워 무선 인터넷 버튼을 비밀번호로 잠그고, 요금 때문에 청소년이 자살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무선 인터넷이 생활화됐다. 일본에서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렴한 정액제와 무선망 개방 활성화, 그에 따른 업체 간 경쟁이다.
싱가포르도 ‘무선 인터넷 천국’이다. 무선 인터넷의 발전은 이동통신과 광대역 무선 인터넷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ID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지난 2006년 초 31만7000명에서 2년 후인 2008년 말 247만3600명으로 8배나 늘었다. 현재 싱가포르의 인구가 48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3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3G 가입자 비중인 약 35%와 비교해도 15%P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도 1년 만에 120만명 이상 늘어 현재는 80%에 육박하는 37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과거 무역과 금융이 싱가포르를 먹여살렸다면 지금은 무선 인터넷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과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네티즌의 열성적인 참여로 유선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제는 무선 인터넷을 꽃피워야 할 때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모바일 대운하’가 건설돼야 한다. 모바일 대운하는 이미 구축된 찻길인 디지털 고속도로와 이어져 이공계 회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벤처 활성화, 청년실업 극복 등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바다를 잇는 뱃길이 될 것이다.★
로봇산업을 통한 4만 달러 전략
한국, 로봇산업 가능성 무궁무진
⊙ 통신산업 인프라와 도전정신 갖춘 한국, 세계적 로봇 기술 경쟁력 확보 가능
金汶相 KIST 프론티어 지능로봇사업단장
⊙ 1957년 서울 출생.
⊙ 경기고,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졸업. 同 대학원 유압공학 석사, 독일 베를린공대 대학원 로봇공학
박사.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IPK-베를린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연구부 휴먼로봇연구센터
센터장, 지능로봇연구센터 센터장 등 역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형 휴머노이드 ‘휴보’.> |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는 지난 세기와는 확연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세기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에너지 소비, 인구 증가, 과학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한 엄청난 양적인 변화가 이룩된 시기였다면 21세기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질적인 변혁의 시대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급격하게 진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적 돌파형 기술로는 줄기세포로 대변되는 생명과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과학, 그리고 반도체 산업 등의 근간을 이루는 나노과학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이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이들을 적절히 융합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 로봇 기술이다.
지능 로봇 기술은 인간이 창조한 물건들에 인간성을 부여해 인간과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좀 더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현 시점에서 지능 로봇 기술의 역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휴대전화다. 20여 년 전 휴대전화가 처음 출시됐을 당시, 걸어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전부였다. 이 한 가지 기능만으로도 휴대전화는 인간생활의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다. 정보의 소통이 빨라졌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게 됐다. 컴퓨터가 과학기술의 근본을 변화시켰다면 휴대전화는 인간 소통방식의 근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런 휴대전화의 기능이 21세기에 들어 다시 한 번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능 로봇 기술이 휴대전화에 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순 통화만이 그 기능의 전부인 줄 알았던 휴대전화에 인간의 五感(오감)에 해당하는 시각기술, 음성인식기술, 햅틱 기술들이 사용됐다.
단순 통화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기능이 실현되고 있다. 심심할 때는 게임의 상대가 되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으며 지하철 요금도 낼 수 있다. 기존 카메라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사용자의 모든 연락처와 일정도 관리해 준다.
이러한 지능 로봇 기술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스로 주차하는 자동차, 음성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홈 등 그 영역을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튼튼한지보다 얼마나 편하고 인간적인지에 제품 경쟁력 확보의 승부수가 던져지고 있다.
물론 지능 로봇 기술의 역할은 기존 산업에의 추가적인 성장동력의 제공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SF 영화나 만화에서나 봐왔던, 그리고 전혀 가능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지능 로봇에 의해 펼쳐지기 시작했다.
현실과 기대의 심각한 괴리
10년 전 직립보행 로봇 P2가 일본 혼다社(사)에 의해 출현했다. 그 후 세계 각국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인간생활에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시장이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당장 개발될 것 같던 지능형 로봇은 좀처럼 선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만개할 것 같았던 지능 로봇 시장은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했다.
현실과 기대의 ‘심각한 괴리’를 발생시킨 원인으로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설득력 있는 주장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실제 로봇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단시간에 그 격차를 줄이기엔 로봇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상 발생하는 난관이 생각보다 크다.
최근 인간과 같이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 개발에 주력했던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전략에 대해 많은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두 발로 걷는 로봇을 갖는다는 것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선진국은 미래 지능 로봇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모두 다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철저히 실용성에 근간을 둬야 한다고 믿는 서구인들은 궁극적으로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모습을 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들은 미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형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에 충실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자면 청소 로봇의 경우 인간형 로봇이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형태보다는 기존 청소기에 바퀴를 달아 청소 행위 자체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로봇 분야 발전계획이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사실 각 가정에 1대의 로봇이 보급돼 인간이 하기 귀찮거나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고자 한다면 두 발로 걷는 기능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기술이 있다. 바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 사고에 해당하는 지능체계의 구축과, 오감을 대신하는 로봇의 신뢰성 있는 인식 기술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 경쟁력이 있는 로봇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누가 이런 지능 로봇시장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가는 인식 기술 및 지능체계를 누가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다.
로봇시장의 폭발적 성장 준비해야
앞으로 로봇시장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는 어떻게 이를 대비해야 할까. 로봇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비효율적이고 단순하며 힘든 노동환경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 혹은 건설과 같은 특수 용도의 로봇 등이다. 이 분야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돼 왔고, 앞으로도 그 적용 영역을 꾸준히 넓혀갈 것이다.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기간산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에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로봇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영역이다. 지뢰와 같은 폭발물처리, 심해 탐사 혹은 군사작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극한작업 로봇과 노인 부양을 위한 실버 로봇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귀함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로봇 관련 기술이다. 로봇의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국가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분야다. 이 시장은 필요성이 확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빨리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교육, 오락 등 개인용 서비스 로봇이다. 이 분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의해 지갑을 열어 구입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인데, 적극적인 표준화 체계의 구축, 부품이나 센서 등의 인프라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언제 지능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형성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향후 이 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우리 국민의 ‘새로움에 대한 강렬한 욕구’다. 로봇 산업은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로서 매우 창조적인 융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신명 나는 도전정신이 잘 맞아떨어진다. 세계시장에서 善戰(선전)하는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산업의 경쟁력을 뒤돌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통신산업 인프라다. 로봇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식산업과의 연계를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적용, 이를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이는 일본 등의 선진국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지원정책 요구돼
다만 인력이나 산업 규모, 이를 위한 연구 개발 인프라가 약한 우리나라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잘 짜인 발전 전략이 필수적이다. 부품산업의 지원, 표준화를 위한 노력,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 개발 로드맵, 탄탄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준비돼야 한다.
李昌鎬(이창호) 명인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초반에 멋진 포석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듯 지능 로봇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선진국들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국가적 포석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 평창이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하계·동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
국가 반열에 오를 것
愼鏞碩
⊙ 1941년 인천 출생.
⊙ 서울대 농대, 서울대 신문대학원 졸업.
⊙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국제부장·사회부장·논설위원, 관훈클럽 총무 역임.
⊙ 세계사격대회, 88서울올림픽, FIFA 월드컵 및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 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외협력 위원장.

대한민국 현대사와 스포츠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의 청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월계관을 쓰는 순간 우리 민족은 환희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과 일장기 말소사건은 식민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함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손 선수의 마라톤 우승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라톤 열기가 달아올랐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많은 마라토너를 탄생시켰다. 손 선수의 정신적 제자였던 이들은 광복 직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를 석권함으로써 마라톤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1947년(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서윤복 선수가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고, 1950년(제54회 보스턴마라톤)에는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선수가 1~3위를 휩쓸어 기염을 토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는 힘들게 선수단을 보냈고 온 국민이 마라톤 종목에 기대를 걸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필자는 어른들 틈에서 음질이 나쁜 라디오 중계방송을 통해 최윤칠 선수가 4위로 골인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던 기억이 새롭다.
戰後(전후)복구사업과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 스포츠는 국제무대에서 침체한 모습이었다. 농구, 탁구, 축구, 권투, 레슬링, 역도, 유도 같은 종목에서 간혹 메달을 따내기는 했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으로 딴 것은 1976년 몬트리올 대회(레슬링 양정모)였다.
1981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IOC총회에서 일본의 나고야와 대결해 52 대 27이란 압도적 표차로 1988년 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한 것은 우리 현대사에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올림픽 유치단의 일원으로 바덴바덴에서 유치전략과 득표 활동에 깊이 관계했던 필자는 지금도 88서울올림픽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가 우리나라의 國運(국운)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확신하고 있다.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88서울올림픽 2년 전에 열렸던 아시안게임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멀티·스포츠 게임이었다. 동시에 2년 후 개최될 올림픽 운영을 위한 경험을 쌓고, 중국을 포함한 동유럽의 서울올림픽 참가의 길을 열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은 舊(구)소련을 위시한 동구 諸國(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소련의 개혁개방과 동유럽의 자유화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주최했던 FIFA 월드컵대회 역시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축제를 연출했다. 월드컵은 88올림픽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가치를 올려 세계의 중심국가로 진입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광고비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왔다.
돌이켜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에 이르기까지 66년 동안 대한민국은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스포츠야말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국가 발전에 공헌한 일등공신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제스포츠기구에도 한국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져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는 한때 3명의 한국인이 IOC 위원으로 활동했다. 올림픽대회에서도 계속 10위권을 지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FIFA 월드컵대회에도 1954년 대회 이후 32년 동안 한 차례도 본선 진출을 못하다가 1986년부터는 연속으로 7번째 출전(브라질 18회, 독일 14회, 이탈리아 12회, 아르헨티나 9회, 스페인 8회)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로 꼽히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 스포츠는 안팎의 도전에 직면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체육을 황폐화시켜 청소년 스포츠는 심각할 정도로 위축됐다. 한때 우리는 3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8년 임기의 문대성씨 한 명뿐이다.
한국 스포츠의 총본산인 대한체육회장의 잦은 교체와 정치권력의 개입 또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회장 교체 때마다 전임 회장이 獄苦(옥고)를 치르는가 하면 정치권에서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가 한국 체육계의 대외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두 차례나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평창이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하계 및 동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만이 그랜드슬램 국가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 三修(삼수)에 성공하면 6번째의 영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서 탈피해야
그러나 그랜드슬램 국가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위시하여 세계적인 종합스포츠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기 위한 집중적인 전략을 추구해 왔다. 한국의 메달박스는 과거 권투, 레슬링, 유도 등에서 양궁, 배드민턴, 역도, 사격 등으로 변해 왔지만, 스포츠의 기본인 육상과 수영에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종목편중은 동계스포츠도 마찬가지다. 메달 획득 위주의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기초 종목의 경기력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대한민국처럼 스포츠를 통해서 식민지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경제 개방과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하게 된 나라도 드물다. 한국이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과정에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체육의 사령탑인 대한체육회(KOC)를 엘리트 스포츠만을 관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체육 전반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총본산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필자가 아시안게임 유치와 준비과정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스포츠 지도사들은 한국의 스포츠 수준은 높은데 KOC의 지도부는 왜 자주 바뀌며, 체육인들의 역할이 미미하냐는 질문을 자주 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정치권의 간섭과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체육인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체육회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두 번째로는 기초스포츠의 발전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과연 우리 선수가 메달을 몇 개나 딸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 스포츠의 현주소다.
우리의 체육정책은 대형 국제대회에서 하나라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때문에 육상, 수영, 체조 같은 기초 스포츠는 비인기 스포츠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기초 스포츠 진흥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해당 경기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나서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 체육과 국민 체육진흥도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의 당면과제다. 치열한 입시경쟁에 학교 체육이 위축되고 국민 체육이 프로 스포츠 관전과 일부 계층의 특수 스포츠 애호로 둔갑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하루빨리 수반돼야 한다.
셋째는 스포츠 선진국다운 國格(국격)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유치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8년 11월 12일 ‘2010년 제16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의 광저우(廣州)에서 마련한 1년 전 카운트다운 행사에 참석해서 광저우게임 조직위원회와 베이징 중앙정부 지도자들의 깊은 속내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성공했다고 해서 2년 후에 열리는 2010년 아시안게임을 소홀히 한다면 40억 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삼수에 도전하는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대회 유치작전도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펼쳐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를 해야 한다.
스포츠 정책과 방향을 개선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통해 4만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 메달 따기 위주의 스포츠정책보다는 많은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고루 메달을 따면서 올림픽 지상주의사고에서 벗어날 때 1인당 4만 달러 소득시대가 열릴 것이다.★
산림을 통한 4만 달러 달성 전략
山林 자원의 가치가 國格이다
⊙ 연간 2~3%씩 임목축적이 증가하면 현재의 산림자원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2000만~3000만㎥의
목재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
鄭光秀 산림청장
⊙ 1953년 강원도 춘천 출생.
⊙ 춘천고·강원대 임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임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제15회 기술고시 합격,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림청 차장 역임.

우리나라는 山林(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다. 그만큼 산림이 국토의 이용, 나아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1970년대 초부터 과거 100년 이상 진행됐던 산림 황폐화의 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됐다. 산림의 量的(양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당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952년 약 6㎥에서 2008년에는 104㎥로 약 18배나 증가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 1973년 제1차 치산녹화사업으로 대표되는 산림녹화정책과 가정용 연료를 화석연료로 대체하는 정책이 잘 결합돼 나타난 결과다.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런 평가 속에 우리는 지난 60년간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선진녹색 국가의 토대를 만들었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低(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우리 산림의 잠재가치를 극대화할 것이 요구된다. 세계적으로도 녹색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녹색자원,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자원, 高(고)부가가치 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제자원, 그리고 산림의 公益(공익)기능을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자원이기 때문이다.
먼저, 식용·약용 자원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형, 지질, 기후가 다양해 온대지역 중 상대적으로 식물種(종)이 풍부하다. 국내 식물자원은 8896종에 이르며, 이 중 외래식물을 제외한 자생식물 자원만도 8458종(목본 1178종, 초본 2980종, 선태식물 등 4300종)에 달한다.
이 중 약용과 식용 식물은 약 2104종류에 이른다. 이러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일찍이 깨달은 선진국들은 주목에서 항암제를, 은행나무에서 혈액순환제를, 버드나무에서는 해열제를, 엉겅퀴에서는 간염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의약품의 30%가 식물에서 나와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인더스트리’社(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2007년 약 723억 달러에 달했고, 2010년까지 약 10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형 중심시장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소득의 증가를 예상하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의 30%가 식물로부터 추출되는 약효성분으로 제조되며,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120여 종의 의약품 시장 규모도 약 10조 달러로 추정된다. 독일은 은행잎의 약효 성분을 이용한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개발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다.
우리 임산물은 고품질의 천연 식·약용 자재로 활용도가 높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송이, 표고버섯 등과 같이 영양이 뛰어나고 향이 좋아 이미 수요가 많은 품목도 있다. 이런 우수한 국내 임산물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主産(주산) 지역에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고, 기능성 식품과 약용산업을 연계시켜 산림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보물산’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山養蔘(산양삼)의 경우 재배와 유통과정에서 청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과거 해외시장에서 고려인삼이 누렸던 명성을 되찾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국민의 식품안전과 직결된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청정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을 8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생산지원과 생명공학(BT) 등 연구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무는 재생 가능 자원
둘째, 산림자원의 순환이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난 60여 년 동안 나무를 잘 심고 가꾸어 현재와 같은 산림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면, 지금부터는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통해 국민총생산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나무가 석유나 석탄과 달리 재생가능한 자원이며, 벌채시기에 도달하는 산림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970~1980년대 대규모 조림의 영향으로 현재 우리 산림의 나이 구조는 21~40년생이 면적 기준으로 67%, 임목축적 기준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국가산림자원조사를 197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산림자원을 전망한 결과, 총 임목축적량은 약 11억㎥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2~3%씩 임목축적이 증가한다면 현재의 산림자원을 유지하면서도 매년 2000만~3000만㎥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잠재력으로만 본다면 2020년엔 우리나라 목재 수요의 상당부분을 국산재로 공급할 수도 있다.
국산 목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수입 목재에 비해 낮은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당연히 국산 목재의 생산 비용을 낮추고 질을 높여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자가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림 도로를 넓히고 기계화를 확대하는 등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 목재의 질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량한 종자 공급, 조림, 숲가꾸기, 벌채, 가공 및 유통 과정을 순환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분포와 소비지를 고려하여 벌채, 가공, 유통 및 소비 과정을 묶어 ‘일관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2020년에는 목재 생산을 통해 GDP도 증가하고 생장량이 떨어지는 산림도 더 건강한 산림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관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버려져 왔던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産物(산물)의 이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숲가꾸기 산물의 확대는 MDF(중밀도 섬유판: 합판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목재를 분쇄 가공하여 판 형태로 성형 가공한 것-편집자 주) 및 목재펠릿(Wood pellets)으로 대표는 산림바이오에너지 원료로 공급될 것이다. 특히 목재펠릿은 화석연료 대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최근 全(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급속히 늘고 있는 산림의 신성장 분야 중 하나이다.
산림배출권 확보
녹색성장 시대에 목재는 건물 자재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선진국가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Green Building)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피도니아그룹에 따르면, 미국의 그린빌딩 자재시장 규모는 2013년까지 매년 7.2% 성장해 약 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는 인증받은 목재자재로서 2013년까지 시장규모가 2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 산림환경서비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목재와 단기소득 임산물처럼 눈에 보이는 자원뿐만 아니라 산림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과 산림휴양 기능을 상품화한다면 산림경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은 이미 2008년 기준으로 144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탄소시장이 2010년에 18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는 활동으로 조림과 산림경영 활동을 포함했다. 산림을 잘 심고 관리하면 탄소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해 국내 산림배출권 확보를 비용 효율적인 감축 대안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큰 국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산림을 활용한 상쇄 활동이 포함된다면 GDP에 기여하는 산림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다.
산림자원은 토지공급기능, 문화적 기능 등 자원으로서 다양한 가치가 있다. 한 국가의 산림 모습은 그 나라의 品格(품격)을 나타낸다. 산림을 잘 관리하는 일은 국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64%인 산림이 비중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한국은 23.1%에 불과
⊙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 10개국에 28개의 자원개발사업 보유
金信鍾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 1950년 경북 안동 출생.
⊙ 경북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플로리다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통상산업부 駐타이베이 상무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실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역임.
한국은 유연탄 수입 세계 2위, 철·구리·우라늄은 4~6위권의 수입大國(대국)이다. 이는 한국의 주력산업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광물수요량이 큰 업종인 데서 비롯된다. 또 전력 생산에서도 광물의 비중이 높은데, 원별 발전량은 유연탄 39.9%>원자력(우라늄) 35.7%>가스 17.9%>석유 3.7%로 유연탄과 우라늄이 국내 발전의 75.6%를 담당하고 있다.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에선 광물자원이 많지 않아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이다.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려면 그만큼 원자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진다.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의 첫 숙제는 ‘질좋은 원료를, 보다 싼 값에,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자원산업은 흔히 ‘대박산업’으로 불린다. 기대수익률이 통상 13% 내외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들고 투자회수기간(PBP)이 길며, 투자 실패 시 잔존가치가 낮은 데다가 생산 및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분야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릭스(BRIC’s), 일본, 프랑스 등 자원 소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
자원산업은 흔히 ‘대박산업’으로 불린다. 기대수익률이 통상 13% 내외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들고 투자회수기간(PBP)이 길며, 투자 실패 시 잔존가치가 낮은 데다가 생산 및 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 단독으로는 자발적인 투자가 어려운 분야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브릭스(BRIC’s), 일본, 프랑스 등 자원 소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다.
2008년 불어온 글로벌 외환위기는 자원전쟁에 새로운 불을 댕겼다. 광물가격이 바닥을 치자 중국이나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M&A 하거나 지분인수에 나선 것이다. 가격이 低點(저점)일 때 勢(세) 불리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속셈이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공급력 확보→유통시장 장악→가격결정 주도라는 순환을 통해 자원개발기업들은 점차 대형화·과점화되고 있다.
자원가격이 2009년 들어 상승했지만,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高點(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의 첫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1977년에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IMF가 닥치자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민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정리한 사업이 해외 자원개발이었다. 광물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야 한국은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게 된다.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자원개발 및 비축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출발부터 늦은 셈이다. 그 결과 정부가 지정한 6대 전략 鑛種(광종)의 자주개발률은 일본이 2008년 말 기준으로 49.6%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겨우 23.1%에 불과한 실정.
투자규모의 차이도 현격하다. 한국의 1년 총 투자비(광물)는 브라질 Vale社(사)의 6.1% 수준. 광물자원공사를 현재의 5배 규모로 키운다 해도, 메이저기업의 10분의 1도 안된다. 자원전쟁의 현장에서 느낀 광물공사는 골리앗들의 싸움에 끼인 다윗의 처지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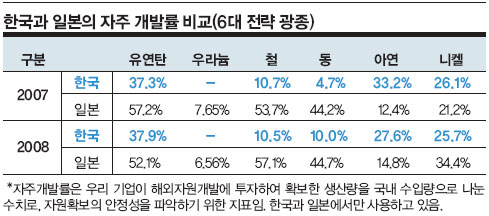
중국과 맞붙어 4전 全敗
결과는 혹독했다. 작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확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맞붙어 4전 全敗(전패)를 했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은 자원전쟁에서 한국이 연전연패하고 있다며 걱정했다. 거론됐던 4전 중 3전이 우리 공사의 사례였으니, 씁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 번째 건은 호주의 로즈베리 동·아연 광산이었다. 2008년 말 오즈미네랄사는 자금부족으로 회사 소유의 로즈베리 광산 매각 추진 공고를 냈다. 우리 공사는 즉시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지분 인수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이듬해 2월경 협상이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측이 오즈미네랄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결국 6월 중국 민메탈스(Minmetals)는 로즈베리 광산이 아니라 모회사를 약 14억 달러에 통째로 인수했다. 한국과 중국 간 투자규모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마지막 싸움은 2009년 7월 캐나다에서 벌어졌다. 매장량 5억8000만t 규모의 블룸레이크 철광 지분 인수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맞붙은 것이다. 결국 캐나다는 전방위 로비를 펼친 중국 우한철강을 선택했다. 인수금액은 광물공사가 제시했던 2억 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2억4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언론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검토 중이던 사업에서 일본·중국 등에 밀린 사례는 몇 가지 더 있다. 일련의 자원확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자금·규모·로비력 등의 차이를 실감했다.
일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광물공사는 현재 해외 10개국에 28개의 자원개발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호주나 캐나다 같은 자원 선진국의 프로젝트다. 2009년에는 이런 선진국들보다는 우리가 진출하지 않았던 아프리카나 남미지역을 공략했고, 세계적으로 자원확보 전쟁이 가장 뜨겁게 벌어진 우라늄·동 분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協業체제로 대응

이러한 자원확보 전쟁의 뒤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산지대나 오지를 오간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필자도 2009년 3월에 아프리카 니제르 방문 길에 황열병 예방주사의 부작용으로 곤욕을 치렀고, 볼리비아에서는 고산병으로 고생했다. 또 해당 국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 자동차, 배를 갈아타며 이틀을 날아가 늦은 밤에 정장을 차려입고 몇 시간이나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 우리 공사는 외국 국가로는 처음으로 볼리비아와 우유니 광산의 리튬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리튬이 차세대 에너지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볼리비아 리튬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다.
또 파나마에서는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15위 규모인 초대형 구리광산 지분 20%를 인수했다. 이로써 광물공사는 파나마, 볼리비아, 페루 등 중남미의 유망한 구리사업을 연이어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정밀한 자원외교를 통해 자원보유국에 경제발전의 경험을 전수하고 산업협력, 국제원조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초대형기업으로 육성하며, 민간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0년 후에 결실이 나타날 것
세계 각국은 자원 선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열해질 이 전쟁에 한국도 가세했다. IMF 위기에 가장 먼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정리했던 민간기업들도 2008년 이후로는 폭발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과 대비책을 쏟아내며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고, 공기업은 최전선에서 몸으로 뛰고 있다. 民官公(민·관·공)이 힘을 합쳐 자원확보와 대한민국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자원산업은 탐사부터 개발, 생산, 활용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진출이 늦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치르고 있는 자원전쟁의 결실은 수년 뒤 GDP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자원확보의 뜨거운 열기가 국내외 자원개발 현장으로 널리,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술은 세계 경제와 권력을 좌우하는 세기적 기술 핵융합 관련 연구인력은
선진국이 2만명 이상을 보유. 한국은 1000명 미만
申載仁
⊙ 1942년 광주 출생.
⊙ 광주일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美 MIT대 핵공학 박사.
⊙ MIT대 핵공학과 연구원,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단장,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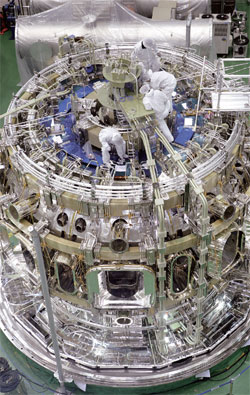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동물이며, 이익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개인이나 집단, 국가가 보이는 반응도 비슷하다. 1996년 美(미) 캘리포니아州(주)의회는 환경 논란에 휩싸인 화력과 원자력 발전시설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부족한 전력은 인접 주에서 빌려오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4년 뒤 유례없는 酷暑(혹서)가 몰려와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세계 원유값은 곱절로 뛰었다. 인접 주에서는 예전 협약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이 없었다. 결국 18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斷電(단전)과 높은 전기요금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풍부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지구의 밤 사진을 보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도시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선진국의 표징은 밝은 도시다.
밝은 생활환경은 잘 보존된 깨끗한 자연환경, 안락한 삶의 환경, 자랑스런 교육과 문화환경이다. 이 밝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안정적인 그린 에너지 확보다.
핵융합에너지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린 기술 에너지’다. 공기와 바닷물 속에 있는 무거운 수소(중수소)와 매우 무거운 수소(삼중수소)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석탄이나 기름이 없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무한 청정 에너지다. 우리의 소득이 4만 달러가 되려면 우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의 4분의 1을 에너지 구입에 사용하는 일부터 근절해야 한다.
수입에너지를 10% 줄이고 대신 국내에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 GDP 5%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핵융합에너지는 2025년 즈음에 발전을 위한 실증로를 건설하고 2050년에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와 수소를 통한 핵융합에너지로 충족시켜 그 자체로도 GDP가 4만 달러 이상이 되도록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현재 핵융합에너지를 실용화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설계는 완성단계에 있다. 2008년에 준공된 초전도 핵융합실험로 K-STAR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설, 운전 중인 세계 최대의 초전도 핵융합실험로다. 이제 남은 일은 K-STAR를 대형화하고 공학적으로 재설계해서 경제적인 핵융합발전로를 건설하는 일이다. 특히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핵융합 관련시장 어마어마
핵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은 쉽지 않고 막대한 연구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EU, 러시아, 중국, 인도는 ITER라는 실제 규모의 핵융합로를 프랑스에 건설하고 있다. ITER가 성공하면 이들 일곱 나라는 먼저 세계 핵융합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체제로 돌변할 것이다.
핵융합에너지는 1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수소를 만들어 연료전지를 가동시키며, 자동차 엔진이나 보일러의 연소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독성 방사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고,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적인 산업적 활용분야는 전력공급, 지역난방, 해수 담수화, 산업용 수소 생산 등이다.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2차기술인 플라스마, 초고온, 고진공, 초전도기술, 低(저)방사화 재료, 초고속 계산 및 정보기술들은 전기전자, 기계, 반도체, 신소재, 의료, 국방, 환경, 항공, 우주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전도기술과 고자장기술을 이용한 의료용 MRI 개발과 생산은 뇌 연구와 치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극저온기술은 에너지 저장과 자기부상열차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래식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2030년을 중심으로 보면 핵융합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장은 1.5GWe 핵융합발전소 건설비용을 약 40억 달러로 산정할 때 極東(극동)지역에서만 최소 연간 8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운전 및 보수, 교육 및 훈련, 부품산업까지 고려하면 시장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핵융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온실가스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창출되고, 특히 연간 1조원에 해당되는 파생기술에 대한 연구와 산업적 응용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총생산이 매년 100억 달러 수준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핵융합에너지 시장은 그 일부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크고 가치가 있는 시장임이 분명하다.
세계 패권 가름하는 세기적 기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는 그 높은 가치성과 필요성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 1차대전의 세계 패권을 결정한 내연기관과 더불어 미래 세계 경제와 권력을 좌우하는 세기적 기술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과학 선진국들은 핵융합에너지 기술의 우위성을 점하기 위해 분초를 아껴 경쟁하고 있다.
선진국들, 특히 미국·유럽·일본은 반세기 전부터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연구는 20년이 채 안된다. 방사성 재료 개발과 같은 기초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능력도 미약하다. 연구인력 역시 대부분 국가가 2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000명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도 많다. 현재 우리가 상업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경험과 실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초고진공, 극저온, 고온을 다루는 極限(극한)기술에 대한 산업체의 생산기술 능력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산업체기술들은 LNG 수송선을 만드는 조선기술, 반도체 제조기술, 초전도 전선 제조기술들로부터 나온다.
핵융합에너지는 현재 상용화에 앞서 실증 단계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작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 최첨단, 최대 초전도 핵융합실험장치인 K-STAR를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산업체 기술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핵융합에너지의 연료인 무거운 수소들이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꼭 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 수소를 채집하는 시설, 운반도구들도 완공돼 가동·사용하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부분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는 다른 기술로, 우리의 특별한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개발 전략은 우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에너지 시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예산 규모는 강대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우리보다 30년 앞서 핵융합 연구개발을 시작한 선진국들이 보유한 원천기술들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 총력전 펼쳐야
이 경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창의적 두뇌와 기술력으로 핵심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 외의 중요 기술들은 국제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선 핵융합에너지 공학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소에 핵융합로공학팀을 특별히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대 공대에 ‘핵융합로공학 선행연구센터’를 설치, 전국 대학의 핵융합로공학 연구인력을 결집, 공동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은 2015년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우리가 목표했던 4만 달러 달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에너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자체 생산하는 녹색 청정기술에너지 없이는 4만 달러 달성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환경규제가 없었던 低(저)유가시대에 이 고지를 점령했다.
핵융합에너지는 성숙된 에너지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상용화를 추진하면 핵융합에너지는 4만 달러 작전의 핵심 공격수가 될 것이다.★
韓食의 세계화 전략
철저한 현지화, 표준화로 현지인 韓食요리사 양성해야
⊙ 일본 스시의 세계화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일본 특유의 근성과 일본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
⊙ 韓食 세계화를 위해서는 와인과 궁합이 맞는 음식 개발이 필요
서홍진 ㈜Raei 수석 컨설턴트·前 삼성에버랜드 골프문화사업부 식음팀장
⊙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 서울YMCA호텔전문학교 수료.
⊙ 서울 신라호텔 F&B(식음) 매니저, 서울르네상스호텔 F&B매니저, 삼성에버랜드 리조트 식음팀
차장, 同 골프문화사업부 식음팀장, 삼성인력개발원 국제테이블매너·에티켓 강사 역임.
세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총성 없는 문화전쟁 시대에 돌입했다. 문화전쟁의 핵심에는 음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음식문화는 상대국에 감성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自國(자국) 음식의 세계화에 정열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韓食(한식)을 세계 5대 음식의 하나로 만들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한식의 세계화를 표방하며 여러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의 관심표명과 목소리가 커지면서 어수선한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 산하 각종 연구소나 기관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한국 전통음식연구소나 궁중요리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복분자 연구소, 홍삼 연구소, 세계 김치 연구소 등이 착공되거나 문을 열었다. 여기에 더해 용인의 떡볶이 연구소, 전주시의 비빔밥 연구소, 부산 신라대의 막걸리 세계화 연구소, 안성시 한경대의 막걸리 연구소 등을 포함해 한식 또는 전통식품, 전통주와 관련한 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지자체나 대학교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들 연구소의 방향과 역할이 상당 부분이 기존의 국가나 기업, 학계와 중복된다는 점이다. 김치를 비롯한 전통 장류와 한식, 전통주 분야는 이미 여러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국식품연구원과 한식세계화사업단도 별도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식 관련 연구소와 部處(부처)의 난립으로 업무혼선, 중복투자와 과열경쟁, 지역과 부서 간의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부주도의 조직정비를 제안한다. 정부는 해외식품박람회 사업 추진 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포함하면서, 각종 단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강력한 범국가적 조직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한식요리 전문가는 물론 전통음료 및 酒類(주류), 위생, 디자인, 운영 및 서비스, 기물관리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식음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전통한식(궁중요리 포함)과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들의 전통요리의 기술이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생문제 개선, 조리법 표준화 시급

현재 우리나라의 한식 세계화 사업에서는 민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일본, 태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自國(자국) 음식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서양인들이 국내 대중식당을 이용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이 ‘냅킨 문화’다. 지금은 계도가 많이 되어 다양한 식탁용 냅킨이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식당에서는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를 냅킨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두루마리 휴지를 식탁 주위에 비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비위생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다. 또 韓食堂(한식당)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테이블에서 식사할 경우 찬이나 찌개 등을 여러 명이 같이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데, 이것 또한 비위생적이다. 1인용 찬그릇이나 국물용 개인용기와 별도의 국자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식당 근무자들이 투철한 프로정신을 가지고, 청결유지와 개인위생을 준수하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한식 세계화의 기본이다.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잘 활용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늘 즐겨 먹는 우리 음식이 많지만, 이를 직접 제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리법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우리 음식 재료의 상당 부분이 발효 음식이라 재료를 만드는 것도 어렵다. 우선 복잡한 조리법을 단순화하고, 국제적인 계량단위에 맞춰야 한다. 적당량, 큰 술, 작은 술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들은 온스(oz), g, cm, 분, 초와 같은 세계 공용의 계량단위로 바꿔야 하며, 조리 후 음식의 산출량(1인분 기준량)을 표준화하는 등 국제 기준의 조리법(Recipe)이 全(전) 한식 요리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세계 어느 조리사가 만들어도 유사한 맛과 모양, 양을 보여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한식 조리사를 양성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국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된 한식의 영어 표준 표기법도 개선해야 한다. 미국에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김치는 기무치(Kimuchi), 갈비는 가루비(karubi)로 통일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한식당은 김치만 해도 Kimchi, Kimchee, Gimchy 등 제각각이다.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일본의 대표적인 요리 ‘스시’ 가운데 압도적인 인기를 끄는 것이 ‘마끼’(김을 이용해 밥, 야채, 게살 등을 만 것으로 ‘캘리포니아 롤’이 대표적)다. 스시의 판매 금액 중 80% 정도를 마끼가 차지한다. 니기리 스시(밥 위에 생선을 얹은 정통 스시)를 먹는 미국인은 극소수다. 즉, 현지화의 산물인 캘리포니아 롤의 탄생이 없었다면 스시 붐도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그밖에 일본의 대표 음식인 라면, 카레라이스, 도리아, 고로케, 요깡, 뎀뿌라 등도 일본인들이 외래음식을 再(재)창조해서 세계화한 것들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생각해 보자. 1997년 일본과의 김치 규격분쟁에서 이겼다고 하여 이를 일본의 ‘기무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간다면 곤란하다. 기무치는 김치를 일본인의 입맛에 변화시킨 현지화의 産物(산물)이다.
기무치를 부정하는 것은 김치의 현지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김치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음식, 그들의 전통적인 기호, 식생활 양식 등에 부합하도록 과감하게 변신해야 한다. 우리 음식이라고 우리 방식(주인)대로만 고집해선 현지화(손님)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와인과 한식, 그리고 막걸리
음식문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어권에서는 식음을 F&B, 즉 푸드&베버리지(Food&Beverage)라 부른다. F&B는 항상 어우러지는 것이다.
F&B 중에서 식탁의 꽃이라 불리는 와인을 요리의 나라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선 거의 常飮(상음)한다.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식에 와인을 飯酒(반주)로 어울릴 수 있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는 와인을 모르고서는 일류 조리사의 반열에 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한식)조리사들도 한식의 세계화와 고급 한식을 위해서는 와인을 알아야 한다.
와인과 병행하여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와인등급 구분처럼 막걸리도 만들어지는 재료나 기술에 따라 등급 구분을 하여 가격부터 차별화해야 한다. 다른 우리의 전통주들과 더불어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적절한 네이밍(Naming) 과정을 거치면 세계적인 명품 막걸리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각 패키지 상품에 막걸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막걸리는 빈대떡, 파전, 순대, 두부김치 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으로 잠재력이 크며, 사이다나 오렌지 주스 등을 활용한 막걸리 칵테일도 세계인의 호감을 얻을 만하다.
셋째, 막걸리는 마신 후 포만감이 강한 술이기 때문에 식사 시 반주로 상음하기 불리하고, 색감이 탁해서 상품성으로도 불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한식 세계화 방법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 여수박람회 등 향후 많은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둔 우리로서는 이 행사와 더불어 한식관련 이벤트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일본정부는 서양인들을 위한 메뉴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일본 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했다. 1981년에는 농림수산성 산하에 ‘외식산업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했고, 2005년에는 ‘수출촉진 전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2010년까지 日食(일식) 애호가를 12억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도쿄 올림픽을 전후하여 소개된 스시는 세계 최고의 일본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스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스시를 파는 식당도 ‘작은 일본’으로 만들어 갔다. 실내장식, 꽃꽂이, 도자기, 기모노, 예절, 위생과 청결, 시청각적인 미의 창조 등 대표적인 일본문화를 일본 식당에 접목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특급 호텔의 경우 한식당의 존재가치가 대단히 크지만 경영난이 심해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기술과 능력이 절정에 오른 식음 전문인력(조리사, 지배인 등)들이 호텔을 떠나고 있다. 한 나라의 음식문화 전파는 반도체, 자동차, 배 등을 만들어 내다 파는 일과는 다르다. 음식은 상품이라기보다는 문화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국 식음 문화에 21세기의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세계로 뻗어나갈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4만 달러 달성을 위한 防産 수출 전략
2012년, 방산수출 10大 强國 진입이 목표
⊙ 방사청, 144개의 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190개 민간업체에 移轉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11 복합형 소총’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칸듐 함유 알루미늄 소재’는
인라인스케이트, 야구방망이 등 일상생활 용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卞武根 방위사업청장
⊙ 1946년 경북 김천 출생.
⊙ 경북고, 해군사관학교(24기) 졸업. 국방대학원 수료, 경남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연수.
⊙ 합참 작전기획처장, 3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인사 및 정보작전참모부장, 해군교육사령관,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역임.

|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이 멋진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T-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로, 해외 수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속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軍(군) 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발전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최근 들어 정보·과학전의 시대로 전쟁의 양상이 進化(진화)하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정보 기술(IT), 바이오 기술(BT), 나노 기술(NT)과 같은 새로운 첨단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나 위성항법장치(GPS)처럼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과학기술을 선도해 온 사례를 흔히 보게 된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실용화되는 방위산업은 분명 국가 산업의 高度化(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李明博(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산업의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再(재)조명되면서 ‘방위산업의 新(신)경제성장 동력화’가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한정된 나라를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확보가 유일한 수단이다. 높은 개발위험과 투자비용, 미성숙된 시장 등으로 인해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정부가 선도투자를 통해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확보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민간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가 그렇다.
국방연구개발비, 국방비의 5.6%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産學硏(산학연)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民軍(민군)기술교류의 활성화는 그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과 민간 분야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은 국방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2009년 국방 연구개발 투자는 국방비 대비 5.6%(1조6000억원) 수준이다. 물론 2004년 7757억원(국방비 대비 4.1%)에 비하면 금액으로 볼 때 두 배가 넘지만, 국방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다소 부족한 액수다.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투자를 2010년 국방비 대비 6.1%, 2012년까지는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은 더욱 중요하다. 생산 위주의 ‘체계개발’보다는 他(타) 산업분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핵심기술 개발 등 기술개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戰場(전장) 환경을 고려한 IT기술, 無人化(무인화) 기술 등 전략적 육성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에 있어 산학연의 참여와 민군기술교류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산학연 주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12년 50%까지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 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 특화 연구센터’도 매년 2개소 이상 開所(개소)할 계획이다. 특화연구센터는 선정 대상을 기존 대학 위주에서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2009년 5월 개소한 ‘차세대 軍用電源(군용전원) 특화연구센터’의 경우, 4개의 정부출연연구소, 7개 대학, 8개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문을 열어 ‘국방 녹색 핵심 원천기술’인 군용 전원 연구에 착수했다.
우수한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이전도 활발해지고 있다. 방사청 주관으로 기술거래 장터와 기술이전 설명회를 열고 있고, 최근 들어 방위사업법령 개정으로 국방 과학기술의 민수 이전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총 395개의 민간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발굴했고, 그중 144개 기술을 190개의 업체·기관에 이전해 기술 개발·사업화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 R&D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K11 복합형 소총’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스칸듐 함유 알루미늄 소재’는 민수 분야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야구 방망이, 골프 클럽 헤드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용품에도 적용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수리온’ 산업파급 효과 11조4000억원
2009년 7월, 최초의 국산 기동 헬기인 ‘수리온’ 개발은 국방 연구개발 정책들의 긍정적인 면들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수리온’ 試製(시제) 1호기 제작에 국내외 업체, 대학, 연구소 등 총 105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하면서 설계·시험제작·시험평가 등 헬기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리온 개발로 얻게 된 기술 파급효과만 3조8000억원, 산업 파급효과까지 따지면 11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리온 개발을 통해 헬기 개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헬기산업의 성장동력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산수출도 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방산수출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09년 10월 열린 ‘서울 ADEX 2009’ 국제방산전시회에서 필자는 해외 국방 관계자들을 대하면서 우리 방산제품도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우리 기업이 잠수함 제조 선진국인 독일에 잠수함 전투체계를 수출한 사례를 보면, 우리 방산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연 7조원대 시장으로 확대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중국의 低價(저가) 공세와 선진국들의 높은 기술 진입장벽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구매국의 요구 대응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은 무엇보다 서둘러 추진해야 할 현안이다.
2009년은 汎(범) 정부적인 수출지원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해였다. 정부의 각 부처들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했고, 지식경제부와 협조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를 설치했다. 民官軍(민관군)의 총력을 결집한 최초 통합방산전시회인 ‘서울 ADEX 2009’도 개최해 국가적인 방산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방위사업청 내에는 방산수출 지원 총력전을 위해 ‘방산수출 지원추진단’을 출범하고 ‘수출진흥과’를 신설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 조직을 보강했다. 국산 항공기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南美(남미) 국가가 요구하는 ‘정부 간 거래’를 위해 KOTRA를 통해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했다.
방산수출의 成敗(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새롭게 구축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운영의 妙(묘)를 얼마나 잘 살려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의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격변하는 안보여건과 국제환경에 따라 지원체계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방산업계 등 수출관여 기관 간의 방산수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구매국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후속군수지원,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술료 감면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국가 간 외교노선, 구매력, 군사력,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통해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현재 25개국과 체결 중인 방산협력협정 국가를 확대하는 등 방산수출 국제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다지고, 방산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우리나라는 ‘2012년 방산수출 10대 강국 진입’ 목표를 달성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조기 달성에 기여하고, 머지않아 방산수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4만 달러와 경제 안정화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라
⊙ 한국, 200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수에서 33위에 올라
⊙ 위조 상품 구입, 불법 다운로드 등의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기업에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온다
盧成泰 대한생명 경제연구원장
⊙ 1946년 부산 출생.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 한국은행 연구조정실장, 한국경제신문 주필, 명지대 경영대학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임.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려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연평균 8만 달러 이상씩 벌어야 한다. 취업자가 인구의 절반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정규교육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경제사회에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개혁이 절실하다.
교육을 마친 인재가 자유롭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기업에 채용되거나 창업을 하게 되므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그중의 첫째가 될 것이다.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줌으로써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은 많다. 정부에 의한 갖가지 규제와 간섭, 전투적인 노사관계, 고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 효율성이 낮은 금융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다.
이미 소득 4만 달러 고지에 오른 선진국들과 우리 경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가 서비스산업 비중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산업, 즉 3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 3차 산업 비중은 57%였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인데, 주요 선진국들의 생산성이 우리에 비해 평균 1.5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자유기업원의 신재섭 연구원 조사).
금융산업과 의료복지산업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은 1986년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산업 개혁(Big Bang)을 통해 경제를 회복했고, 2000년에는 1인당 GDP가 제조업분야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을 넘어섰다. 이는 금융산업이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한다.
금융성숙도를 보여주는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 GNI)을 보면 우리나라가 2008년말 현재 8.41배로 2007년 미국(9.62배), 일본(12.25배)에 비해 낮다. 금융산업의 고용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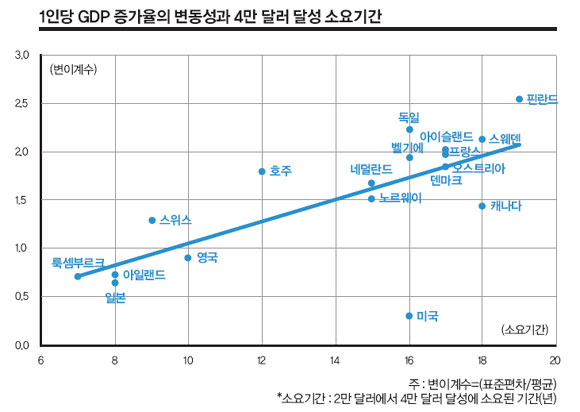
의료서비스·복지서비스 발전시켜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각종 금융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금융의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로 과다한 금융규제와 감독분야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특정 국가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경제자유도가 우리나라는 세계 36위로, 금융산업의 규제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효율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와 금융산업은 규모의 확대와 함께 질적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금융완화와 개방화로 무한경쟁의 체제가 전개되는 만큼 외국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규모를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가 큰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기준으로 48.7%에 달한다. 이는 제조업(27.4%)의 1.8배나 되는 높은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도 16.3명으로 제조업(12.1명)이나 서비스업(13.7명)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3.3명으로 서비스업 평균의 1.7배,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 산업은 성장성도 매우 밝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2005년 기준 6%로, OECD 평균인 9%에 못 미치며 미국(15.3%)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 제조업의 특징
제조업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발전, 제도개혁, 인적 자본 육성과 같은 질적 변화와 함께 미래 가치가 높은 혁신산업 발굴이 필수적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 제조업 분야의 큰 특징은 첨단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가치를 중시한 산업구조조정,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개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해 왔다.
특히 원천기술 또는 첨단기술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기술, 즉 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특정 산업군에서 산출된 재화, 용역, 서비스로서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 역할을 하는 상품)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소득 목표가 정해졌을 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운용은 각종 불균형과 거품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붕괴되면서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경제가 뒷걸음질치면서 줄어든 국민소득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을 중시한 투자 드라이브가 경제 불균형과 위기사태를 야기한 적이 많았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카드사태 등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스웨덴의 경우 1992년에 1인당 GDP 3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곧 이어 닥친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회복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 3만 달러 고지를 탈환한 것은 11년이 지난 2003년이었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아일랜드는 ‘캘트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불리며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의 貧國(빈국)’이었던 이 나라는 적은 인구와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이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아일랜드는 국가부도 위험에 몰리는 등 급격한 침체를 걷고 있다.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글로벌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나라 경제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 있다고 한다.
이 두 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험을 봐도 성장보다 안정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출발해 4만 달러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경제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경기변동성이 컸다. 즉 고성장보다 경제의 안정화가 선진경제 진입의 지름길임을 시사한다.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안정과 과잉중복투자 방지가 필수적이다. 금융과 재정이 방만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차원에서도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0년 '예능力' 전성시대 (0) | 2010.01.17 |
|---|---|
| 다시보는 명약 (0) | 2010.01.12 |
| 국정원 개혁_프리존뉴스발췌 (0) | 2010.01.03 |
| 2009 베스트셀러 (0) | 2010.01.01 |
| 월간조선 신년특집_격변의 2012년, 앞으로 2년 (0) | 2009.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