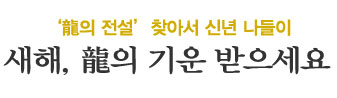 |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쇤다’는 동사를 이끌고 다닙니다. 다른 데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전용(專用)’ 동사를 따로 거느릴 정도로 명절은 특별합니다. ‘쇠다’는 말은 해(태양)의 원말인 ‘솔’에서 나온 말이라는군요. 그러니 ‘설’이라는 명사에서도, ‘쇠다’라는 동사에서도 힘차게 떠오르는 새로운 해를 맞는 기운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제 설이 코앞입니다. 신년 초부터 ‘용의 해’라고 법석을 떨었지만, 아시다시피 12간지야 음력으로 따지는 법이니 진짜 ‘용의 해’는 설날이 지나고부터 시작됩니다. 12간지 중에서 유일한 상상의 동물인 용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낸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올해는 새로 맞는 해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며칠 뒤면 시작될 용의 해를 앞두고 용의 기운이 넘치는 곳들을 골라봤습니다. 전북 김제에 우뚝 세워진 거대한 용의 형상을 찾아갔고, 아홉마리 용이 구불구불 넘어갔다는 구룡령을 찾았습니다. ‘용을 보았다’는 뜻의 ‘관룡(觀龍)’이라고 이름 붙여진 경남 창녕의 산에서는 중생들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반야용선’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용의 이름을 가진 곳부터, 용의 전설이 깃든 곳까지 두루 둘러봤습니다. 용이 이미 상상의 동물일진대 진짜 용의 자취는 있을 리 없고, 그 기운이 서린 곳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소원이 성취될 리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곳을 찾아 출발의 마음을 다지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꼭 신년 초가 아니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여기 소개된 용의 기운이 서린 곳을 접어두었다가 올 한 해 가족들과 함께 찾아 기원의 손길을 모아보시지요. 그렇게 가족들과 따스한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의 해에 찾아가볼 만한,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명소들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백룡과 청룡이 포효하는 ‘용의 땅’… 김제 지금으로부터 1700여년 전 백제 침류왕 때 지어진 전북 김제의 벽골제. 황량한 벌판 속에 희미한 수리(水利)의 흔적만 남아 있는 이곳에는 발톱을 세운 두마리의 용이 시린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서로 마주보며 포효하듯 서 있다.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대나무를 쪼개 비늘을 두른 용의 위용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거대하다. 용 한마리의 몸길이만 54m, 몸통 직경 2m에다 높이는 15m에 달한다. 실제로 용이 있다면 딱 이만했겠다 싶을 정도의 크기다. 두마리 용이 몸을 뒤틀며 발톱을 펼치고 있는 형상에서 이제 막 하늘로 차오를 듯 생동감이 느껴진다. 벽골제에 용의 조형물이 세워진 연유가 이렇다. 한때 이곳은 ‘용의 땅’이었다. 옛사람들은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던 벽골제에 성질이 착해 사람을 도왔다는 백룡과 심술궂어 때로 둑을 무너뜨리곤 했다던 청룡이 살고 있었다고 믿었다. 고대 농업국가에서 물이란 백성들에게는 생명줄이었을 터. 하늘만 바라봐야 했던 천수답 농사를 숙명으로 여겼던 백성들에게 물을 가두고 흘려보내는 대규모 저수지인 벽골제는 가히 혁명으로 다가왔으리라. 당시에 물을 가두고 또 풀어내는 역할은 물을 관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용의 영역이었다. 당시의 백성들이 벽골제에서 용을 보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김제평야에 물을 대던 벽골제는 둘레가 4.4㎞에 달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닥 규모가 크지 않게 느껴지지만 순전히 인력만으로 저수지를 지었을 당시로서는 기념비적인 대역사라 부를 만했으리라. 그건 벽골제 인근인 부량면 용성리의 작은 야산에 붙여진 ‘신털미’란 이름에서도 짐작이 된다. 조선 태종 때 1만명을 동원해 벽골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일하다 지친 인부들이 소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었는데, 그게 모여 ‘신털미산’이 됐다고 전한다. 신년에 김제 땅을 찾아간다면 이름난 절집인 금산사와 100년이 넘는 내력의 금산교회, 그리고 단아한 풍모의 수류성당을 두루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금산사에서는 호젓한 겨울 산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금산교회에서는 100년 전 만석지기 지주가 부리던 마부를 목사로 섬겼던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수류성당에서는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경건한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다. 모두 신년의 희망으로 두 손을 모으기 좋은 곳들이다.
# 용의 벌판에서 돌이 된 독룡을 만나다… 밀양 영문 제목 ‘Secret Sunshine’으로 소개됐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탓일까. 흔히 밀양의 지명을 두고 ‘은밀한 빛’으로 해석하지만, 실제 밀양이란 이름을 한자로 풀이해 보면 ‘빽빽할 밀(密)’에 ‘볕 양(陽)’. 즉 ‘빽빽한 볕’이 내리쪼이는 곳이다. 지명의 연원을 더 깊이 따져본다면 뜻은 전혀 다르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밀양이란 지명은 용을 뜻하는 옛말인 ‘미리(르)’에 ‘벌’(벌판)이 더해진 우리말을 한자로 옮기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밀양의 본뜻은 ‘용이 사는 벌판’ 정도로 풀이해야 옳겠다. 그렇다면 밀양의 용은 어디에 있을까. 단서는 없지만 아마도 자주 범람하는 남천강에서 물을 관장하는 용의 이름이 나왔지 싶다. 밀양에서 용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단연 만어사를 꼽을 수 있겠다. 만어산에 자리 잡은 절집 만어사 미륵전 아래 너덜지대에는 물고기가 변해 돌이 되었다는 만어석(萬魚石)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 이 돌들은 두드리면 맑은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석(鐘石)이라고도 불린다. 만어사에는 용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용의 전설 한두 개쯤 갖지 않은 절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만어사의 전설은 자못 흥미진진하다. 전설 속의 이야기인즉, 지금은 양산 땅인 옥지라는 연못에서 사악한 독룡 한마리와 사람을 잡아먹는 다섯 요괴가 출몰해 온갖 행패를 부리자 가락국 수로왕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해 이들을 감화받게 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독룡을 따라온 물고기들이 산중에 모여들어 함께 돌이 된 후 두드리면 경쇠소리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만어석이 깔린 너덜지대 가장 위쪽에는 5m 높이의 가장 큰 돌이 하나 있는데, 독룡이 부처의 제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만어사를 찾아온 용왕의 아들이 돌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 자리에 미륵전을 지어 법당에 미륵불로 모셔 두고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바위의 직사면에 신기하게도 동전이 쩍쩍 달라붙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밀양을 찾았다면 진주 남강의 촉석루, 평양 대동강 부벽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루도 빼놓을 수 없겠다. 양쪽에 침류당과 능파당이란 건물을 거느린 웅장한 규모의 영남루에 오르면 이 땅에 ‘용의 벌’이란 이름을 갖게 했을 남천강의 물길을 굽어볼 수 있다. # 아홉마리 용이 구불구불 넘어간 고갯길… 구룡령
용은 아홉마리 새끼를 낳는다. 산이나 폭포에 유독 ‘구룡’이라 이름 붙은 지명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아홉마리 용은 저마다 품성이나 특징이 다르다. 이를 테면 맏이인 비희는 거북같이 생겨 무거운 짐을 잘 져 빗돌을 받치는 거북돌에 새겨지고, 둘째는 바라보기를 좋아해 지붕의 머리에 앉히는 문양으로 새겨지고, 셋째는 울기를 잘하며 넷째는 범과 비슷하며, 다섯째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식이다. 이처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저마다 다르니 다리나 비석, 지붕, 그릇에 새겨진 용이 다 같은 용이 아닌 셈이다. 구룡령은 사실 아홉마리가 아니라 90마리가 산다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계곡이 크고 또 깊다. 지금이야 구룡령이란 1013m의 정상을 지나는 포장도로로 차량들이 휙 지나가지만, 진짜 구룡령의 옛길은 산중 깊숙이 숨겨져 있다. 구룡령 정상에서 양양군 서면 갈천리로 이어지는 옛길은 등짐장수들이 홍천의 농산물과 양양의 해산물을 짊어지고 다니던 길이다. 이런 깊은 내력으로 구룡령은 일찌감치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됐다. 숲길은 울창한 소나무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횟돌반쟁이, 솔반쟁이 등을 지나 정상까지는 약 4㎞의 숲길이 이어진다. 숲길은 백두대간과 연결되고 하산길에는 갈천약수 방향으로 내려설 수 있다. 이 길은 신록이 푸른 계절에 걷는 것이 으뜸이긴 하지만, 겨울철에도 못지않다. 구불구불 용이 지나간 흔적 같은 숲길을 따라 소나무숲과 계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다, 옛길 끝에서 만나는 갈천약수에서 톡 쏘는 탄산 약수까지 한 모금 할 수 있다. # 산에 올라 용을 보다… 창녕 관룡사 경남 창녕에는 관룡산이 있다. ‘볼 관(觀)’자에 ‘용 용(龍)’자를 쓰니 풀자면 ‘용을 보다’란 이름이다. 그 이름이 간결하면서도 자못 시적(時的)이다. 우리나라에서 용과 관련된 유래를 가진 산은 얼마나 될까.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해발 100m 이상 되는 산은 4440개. 이 중 용과 관련된 아름을 가진 것만 110개에 달한다. 호랑이나 토끼, 거북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왜 이렇듯 용 이름이 많을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봄을 상징하며 비를 관장하고, 부귀와 풍요를 의미하는 신으로 숭배돼 왔기 때문일 터다.
관룡산이란 이름은 아마도 그 자락에 관룡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리라. 그러나 정작 관룡사는 일주문의 현판에는 관룡산과 이어져 있는 화왕산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관룡사란 절집은 원효대사가 백일기도를 마친 날 화왕산 꼭대기의 연못 세 곳에서 아홉마리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터를 닦았다고 전해진다. 원효가 거기서 용을 보았으니 ‘용을 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관룡산은 곳곳에 바위가 노출돼 있는 험산이다. 관룡산의 바위를 두고 창녕사람들은 ‘용의 등껍질’이라고 했다. 불의 기운을 가진 화왕산을 향하던 용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남긴 자취가 바위가 됐다는 것이다. 관룡산에는 유독 바위가 많다. 그중 압권이 관룡사의 명부전과 요사체 사이로 난 숲길을 따라 20분쯤 오르다가 만나는 용선대다. 용선대는 관룡산 중턱에 불쑥 내민 바위다. 그 바위 위에는 높이 1.8m의 석불좌상이 앉아 있다. 바위 끝에 세워진 석불을 멀리 물러서서 바라보면 마치 불상이 바위로 지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형상이다. 불가의 법화신앙에서 고통의 세상을 건너 극락의 정토로 항해한다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석불의 발 아래 난간에 기대면 수십길 아래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내려다보인다. 거기 서는 것만으로는 고통이 씻길 리 없고, 극락의 정토에도 갈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바위의 뱃머리에 올라 그윽해진 마음으로 그저 번잡스러운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너그러워지고, 새로 시작하는 기운도 얻을 수 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송과 관우가 마신 술 황주(黃酒) (0) | 2012.01.27 |
|---|---|
| 예술가의 집 (0) | 2012.01.23 |
| 발견이의 도보여행_02 (0) | 2012.01.21 |
| 황교익의 味食生活_14 (0) | 2012.01.20 |
| 전남장흥 뜨거운 풍경 (0) | 2012.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