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광한루에 춘향이를 보러 가지만 정작 춘향이는 없다. 광한루에 춘향이 초상이라 해서 일제시대 때 누군가 그려놓았지만 믿을 것은 못 된다. 또 ‘춘향이 무덤’이 있지만 그것 역시 억지춘향 격으로 가짜 무덤이다.
그런데 남원 광한루에 가면 ‘사랑의 화신’ 춘향이보다 더 민중적인 유물 하나를 볼 수 있다. 바로 호랑이 석상이다. 오작교 앞, 완월정(玩月亭) 옆 잔디밭에 있는 호석(虎石)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호랑이 석상은 조선 순조 임금 때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가 남원의 지세를 보고 세운 것이라 한다. 이 광한루의 호랑이 석상과 똑같은 것이 남원 수지면 고정마을에도 있는데 역시 이서구가 만든 것이라 한다.
이서구는 정조 18년(1794)과 순조 20년(1820) 두 번에 걸쳐 전라감사를 지냈으며, 풍수에 능했다는 전설이 호남지방에 아직도 생생하게 전해 내려온다.
전설은 그렇다 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한루의 호랑이 석상과 그곳에서 30리 떨어진 수지면 고정마을에 세워진 호랑이 석상이 동일 시대에 동일인 석공 혹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석상의 모양과 양식이 같고, 세워진 동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 호랑이 석상을 세웠을까? 이는 지극히 풍수적인 원리에서 비롯된다.

호랑이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개다. 남원 남동쪽 30리 거리에 견두산(犬頭山·개머리산·790m)이 있다. 견두산을 바라보면 실제 개처럼 생겼다. 사납고 굶주린 형상으로 구례나 곡성 쪽이 아닌 남원을 노려보는 모습이다. 이렇듯 험한 산세는 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견두산의 거센 기세를 누를 수 있는 것은 호랑이밖에 없다. 당연히 호랑이 석상을 세워 그 기운을 진압하는 ‘진압풍수’의 논리가 개입돼 있는 것이다.
한편 이곳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이 산에 성질 사나운 들개들이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씩 떼지어 살면서 사람과 가축을 해쳤고, 또 이놈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면 무서운 재앙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광한루와 수지면 고정마을에 호랑이 석상을 세워 견두산을 바라보게 했는데, 이후 들개 떼의 재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들개 떼는 짐승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들개 떼만큼 사나운 산적이나 남원고을을 괴롭히던 무장세력일 수도 있다. 실제 두 마리의 호랑이 석상이 마주보고 있는 견두산 정상 아래에는 백제 사찰로 추정되는 극락사가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폐허가 되었다 한다. 사찰을 폐사지로 만든 것은 실제의 빈대가 아니라, 백성을 괴롭혔던 빈대 혹은 들개 떼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광복 전까지만 해도 남원 사람들은 호랑이 석상을 대단히 중시했다. 지금은 비록 춘향이가 ‘살고 있는’ 광한루 담장 안으로 편입되었지만 이전에는 광한루 오작교 앞에 우(牛)시장이 들어섰고, 이곳 일대를 ‘호석(虎石)거리’라 불렀다. 그만큼 호랑이 석상을 ‘춘향이’보다 중시했던 것이다.
또 수지면 고정마을에 있는 호랑이 석상도 마을 사람들이 한때 대단히 중시하여 마을회관 안에 세워놓았다. 그러나 마을의 새 회관이 다른 곳에 세워지면서 호랑이 석상 역시 구 회관 담벼락 밖 시궁창길 위로 밀려났다.
이렇게 광한루와 수지면의 호랑이 석상 모두 견두산의 살기를 더 이상 누를 수 없게 돼버렸다. 전통과 문화의 도시임을 내세우는 남원에서 호랑이 석상을 홀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감이 든다. 특히 호랑이 석상을 잃어버리는 것도 시간문제일 성싶다. 골목에 방치된 호랑이 석상을 불량한 골동품상들이 트럭으로 밤새 실어가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문화유산이 너무 홀대당하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수로왕릉이 있는 경남 김해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예부터 그 형상이 거북, 용, 호랑이 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어져 왔다. 이 때문에 김해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곳에서 수로왕 이후 사라진 ‘훌륭한’ 임금이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의 산들은 다음 세 가지의 기운을 갖고 있다. 첫째, 거북을 닮아 인자하며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성군(聖君)의 출현을 상징한다. 둘째, 용의 기상을 닮아 풍운조화를 주관하는 기운이 있으며 역시 임금을 상징한다. 셋째, 산중 호랑이의 무서운 기질도 부분적으로 있으나 역시 뭇 짐승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이렇게 거북, 용, 호랑이의 기운을 제대로 체화(體化)한 인물이 나온다면, 마땅히 그는 훌륭한 제왕이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호랑이의 지나친 살기(殺氣)다. 김해의 산 중 호랑이의 험기를 보여주는 산은 안민산(=임호산)이다. 이는 1820년 곽기형(郭基衡)이 쓴 흥부암 중수기(重修記)에도 언급돼 있다. ‘김해의 오른쪽 안민산은 읍의 백호가 된다. 옛날 풍수사가 이 산에 나쁜 바위가 있어 읍에 이롭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절을 세워 그 험함을 가렸다.’
안민산은 임호산(臨虎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생긴 모양이 호랑이 머리와 같고, 특히 그 벌린 입(虎口)이 너무 험하다. 사나운 호랑이가 김해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김해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만하다. 그러니 호랑이 입을 막아주어야 하고, 바로 그 입막음 장치가 흥부암이라는 사찰이다.

이렇게 ‘진압 풍수’의 논리로 험한 기운 속에 세운 사찰이니 혹자는 좋지 않은 터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절터로서는 더없이 좋다는 게 풍수적 해석이다. 흔히 이런 터를 혈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겸혈(鉗穴)로 분류한다. 겸혈은 민간에서는 삼태기 혈이라고도 하고 호구(虎口)라고도 한다. 아무튼 호랑이 입막음을 했으므로 김해 사람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호랑이 입막음을 한 사찰 역시 좋은 터잡기를 이룬다. 이렇게 풍수적으로 훌륭한 입지를 구축한 사찰은 ‘김해를 번성하게 해주는 절’이라는 뜻으로 흥부암(興府庵)이란 이름도 갖게 된 것.
흥미로운 점은 흥부암 대웅전의 주춧돌도 호랑이 석상이라는 사실이다. 사찰 자체가 호랑이 입막음인데, 거기에 더해 호석상의 주춧돌을 대웅전 기둥 아래 놓아 아예 호랑이를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있으니 매우 강력한 진압풍수다.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자. 김해는 가락국의 근거지다. 옛사람들은 이곳에 도읍을 정할 때 이미 임호산의 사나운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는 수로왕의 처남으로 허왕후를 따라 아유타국에서 온 장유화상(長遊和尙)이 절을 지어 가락국(김해)의 나쁜 기운을 눌렀다는 이야기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해에 터를 잡아 대대로 살아온 이들에게 임호산의 나쁜 기운은 언제나 요주의 대상이었고, 이 나쁜 기운을 눌러줄 수 있는 사찰을 지어 김해의 번영을 기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해는 순화된 호랑이와, 거북 그리고 용의 기운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 것일 터다. 우연인지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노무현씨가 김해 진영 출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로 거북, 용, 호랑이의 기운을 체화한 인물이 아닌지 성급히 추측해 보기도 한다.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마을 입구에는 두 마리의 두꺼비 석상이 있다. 한 마리는 금두꺼비고, 다른 한 마리는 은두꺼비다. 마을 사람들이 두꺼비 석상을 세운 까닭을 들려준다.
“1980년대의 일이다. 참 많이도 죽었다. 저녁에 본 사람 아침에 못 보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못 보고. 나갔다 죽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 멀쩡한 하늘에 벼락이 내리기도 하고.”
이 마을에 재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 때부터였다 한다. 새마을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두꺼비탑을 없애버렸는데, 이후 마을에 죽음의 재앙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지금 보는 두꺼비 석상은 1986년에 세운 것인데, 예전의 두꺼비탑을 복원한 형태라고 한다.
이 마을에 원래 세워져 있던 두꺼비탑도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어른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렇다.

“일제 시절인 소화 8년에 일본놈들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봉황천에 다리를 놓았다. 그 다리가 지네 형상인데, 지네는 제비와 상극이다. 우리 황풍 마을은 제비집터 혈이다. 그래서 집들을 평지가 아니라 산으로 올려서 짓는다. 아무튼 일본놈들이 다리를 놓고 나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지네에 제비 새끼들이 놀란 탓이었다. 그래서 지네와 상극인 두꺼비 석상을 세웠더니 마을은 다시 평온해졌다.”
일제가 지네 형상의 다리(봉황교)를 놓은 바람에 제비집 명당(연소혈) 마을이 불안해서 두꺼비상을 세워 지네를 퇴치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마을을 답사해 보면 두꺼비상이 세워진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제가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 마을 앞의 봉황천은 물길이 황풍 마을 안으로 굽어서 흘러나간다. 즉 마을로서는 반궁수(反弓水, 背流水라고도 함)가 된다. 반궁수의 땅은 이른바 ‘배반의 땅’이라고 해서 고려 태조 왕건은 유훈으로 남겨 전라도 사람을 핍박하게 했다. 그만큼 좋지 않은 땅이다.
실제 반궁수의 땅은 큰물이 범람할 경우 마을이 물의 공격사면이 되어 침수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제방사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물난리로 인한 마을의 피해가 더 심했을 것이다. 지금도 이곳은 ‘봉황천 수해 상습지’ 제방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마을이 얼마나 수해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과거 이곳 사람들은 수해에 대비하고자 마을의 높은 지대에 집터를 잡았고, 마을 입구에는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 또 두꺼비상을 세워 경계심을 갖도록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두꺼비인가? 이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계모 배씨가 콩쥐를 골탕먹일 속셈으로 밑 빠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한다. 온종일 물을 길어 부어도 물이 차지 않아 탈진할 즈음에 몇 백년 묵은 맷방석만한 두꺼비 한 마리가 깨어진 독 밑으로 들어가 막아주니 물이 새지 않았다.’
금산군은 과거 전라도였고 콩쥐팥쥐 설화의 공간적 배경이 전라도 전주였음을 고려해 보면, 전라도 사람들은 두꺼비를 물이 새는 곳을 막아주는 영험한 동물로 인식했던 듯하다. 황풍 마을의 경우도 마을 앞 봉황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독과 같은 존재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수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영험한 존재로 여겼고, 지금도 떠받들고 있는 것이리라.

”박씨 아주머니는 화가 났다. 남편이 바람피웠기 때문이다. 동네 앞에 세워진 좆바위(남근석)가 집에서 빤히 보이기 때문에 집안에 바람피울 사람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 길로 박씨 아주머니는 볏짚단을 가지고 가 좆바위 귀두 부분을 태워버렸다. 귀두 부분이 새까맣게 그을었다. 그러자 남근석의 돌출이 더욱 선명해져 남근의 힘줄처럼 팽팽한 모습이 되었다. 이번에는 김씨 아주머니가 화가 났다. 남편이 바람났기 때문이다. 동네 앞 남근석이 그을면서 더욱더 강해진 양기(陽氣)가 집안에 끼쳐 남편이 바람피운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쓰다 만 페인트 통을 들고 가 남근석 귀두 부분에 아예 통째로 부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 남근석은 하얀 페인트칠이 된 채 동네 앞에 서 있다.”
화가 홍성담 선생의 고향마을 이야기다. 남근석(좆바위)이 언제부턴가 민속학 용어로 쓰이면서 수많은 문화유산 답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없다. 성기(性器)숭배 사상의 흔적이라느니, 아들을 비는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발로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성기 숭배나 기자신앙의 산물이라면 좆바위는 방방곡곡 마을마을마다 있어야 한다. 특정 마을이나 지역에서만 성기 숭배나 기자신앙이 강했던 것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좆바위는 그것이 세워진 주변의 지형지세에서 공통점이 나타난다. 특정한 지기(地氣)가 강한 곳에만 좆바위를 세운다는 것이다. 과연 특정한 지기란 무엇인가.
흔히 풍수에서는 여자의 기, 음기가 강한 곳에는 남자의 기, 양기를 상징하는 남근석을 세워 음기와 양기의 균형을 꾀한다고 말한다. 남해군 남면 가천마을의 좆바위도 그 마을의 음기가 강해서 세운 것이라는 게 인근에서 예비군 중대장을 하고 있는 모씨의 설명이다.
옛사람들은 음기가 강한 지형에서는 여자가 드세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꾀해 마을의 ‘평화’를 모색하려 했다. 그런 점에서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의 암수바위는 가장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남근처럼 생긴 바위와 그 옆에 아기를 밴 듯 배가 불룩한 바위가 놓여 있어 이 둘을 합해 ‘암수바위’라고 부른다.
이 암수바위는 지금으로부터 150여년 전 영조 임금 때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캐내 세운 것이다. 정확히 영조 27년(1751) 음력 10월23일인데, 이후 해마다 10월23일 저녁에 이 바위에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 좆바위는 그 길이가 무려 5.8m나 된다. 자식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공을 들이면 아들을 얻기 때문에 미륵과 같은 존재라 하여 미륵바위 혹은 미륵불이라고도 부른다. 그 좆바위 덕분인지 이 마을에는 아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아들이 많다고 한다.
아무튼 5.8m의 숫바위가 세워진 것은 이곳의 지형이 음기가 강하다는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다른 지역의 좆바위와 마찬가지로 이곳 마을의 뒷산들은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은 주산인 망산과 우백호에 해당하는 응봉산이 가파른 바다로 내려가는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다. 주변 산들의 모양이 좋으면 마을에 길한 영향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흉함을 가져다 주는데, 특히 험한 산세가 온통 바위로 이루어졌으면 그 영향이 신속하고 강력하다고 이야기한다. 이곳 남면 가천마을의 거대한 좆바위 역시 험한 바위가 동네에 끼칠지 모르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즉 주변의 강한 기운을 누르기 위한, 마을 사람 전체의 집단 의지가 반영된 집단 풍수인 셈이다.

흔히 팔공산을 대구의 영산이자 상징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구의 손님산(客山)일 뿐이다. 감영이 있었던 옛날 대구의 주인산(主山: 鎭山)은 연구산(連龜山)으로 현재 대구제일여중이 위치한 곳이다. 연구산이 대구의 주인산이라는 것은 조선 초기에 서거정(徐居正) 등이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된다. “연구산은 대구의 진산이라, 돌거북을 만들어 머리는 남쪽으로 꼬리는 북쪽으로(南頭北尾) 하여 지맥을 통하게 하였다.”
연구산이 대구의 성스러운 산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흔적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선사시대에는 지석묘가 있었으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우제를 지낸 곳이며, 성황당이 있었던 곳이며, 아마도 일제시대에는 신사 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주변에 향교, 원불교 교당 등 종교시설물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연구산(현재는 대구제일여중)에 사람이 만든 거북(자라)바위가 있다.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누가, 언제, 왜 거북바위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거북바위의 위치가 머리는 남쪽, 꼬리는 북쪽으로 돼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곳의 거북바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구의 주산인 연구산과 그 부모가 되는 산(祖山)인 대덕산과의 관계다. 대구 남쪽의 대덕산(660m)은 하나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산이지만 그 이어지는 힘이 약하므로 지기(地氣)가 제대로 흐를 수 없다. 따라서 거북을 연구산과 대덕산 사이에 만들어놓아 지맥의 흐름을 강화하고자 했다. 거북의 꼬리를 북쪽으로 하여 대구를 향하게 하고 머리를 남쪽으로 하여 대덕산을 바라보게 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즉 입으로 대덕산의 지맥을 받아들여 꼬리 부분을 통해 대구에 그 지기를 내뿜어주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거북의 꼬리 부분을 접하는 마을이 잘된다는 풍수 속설과도 일치한다. 거북은 꼬리 부분에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정기를 받아야만 다산과 풍요를 약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조 및 초가 건물이 많고 방화시설이 미비했던 옛날에는 대구에서도 화재가 빈발했다. 화재가 없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염원은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놓게 된다. 그럼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계심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거북이다. 거북은 바다의 신으로 물의 신이기 때문에 강한 화기(火氣)를 제압해 준다.
실제 대구의 남쪽 대덕산은 불기운이 강한 산이다. 산의 모양이 불꽃 모양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대덕산의 많은 부분이 사납고 거대한 암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바위는 풍수에서는 성질상 화기로 본다. 지금은 산림이 우거져 대덕산의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언뜻언뜻 화기(火氣)가 비칠 정도지만, 옛날에는 매우 강력한 화기를 보였을 것이다.
옛사람들은 대구에서 빈발하는 화재를 화기가 강한 대덕산 탓으로 돌리면서, 물의 신인 거북상을 만들어 그 머리를 대덕산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화기를 제압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 역시 진압풍수의 상징이다.
거북바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조차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아마도 고려 혹은 신라 때 만들어졌을 것이다. 아무튼 아무리 늦춰 잡아도 1000년의 역사를 갖는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거북바위는 현재 철창에 갇혀 있다. 또한 위치도 제자리가 아니다. 사연을 살펴보니 이렇다. 대구제일여중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북바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타협 끝에 학교 안에 남겨두긴 하되 운동장 가장자리로 옮겨놓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철창으로 가둬버렸다. 1000년이 넘는 대구의 수호신이 이제는 감옥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옮기는 과정에서 거북의 위치가 동두서미(東頭西尾 :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로 되고 말았다.
거북바위를 원래의 자리에 옮겨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바뀌어야 한다. 철창을 없애야 하고, 거북의 머리가 남쪽으로 오도록 남두북미로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대구가 번창할 것이다.

1950년대 서울 종로구에 유명한 예식장이 하나 있었다. 서울의 명문 자손들이 너도나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과부가 되거나 이혼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그 결혼식장은 문을 닫았다. 현재 이 자리 일부는 빈터로 남아 있고, 빈자리 한가운데에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뿐이다. 나머지 일부는 현재 SK건설 빌딩이 들어서 있다.
원래 이 땅은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이 살았던 집터였지만 예식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즉 일제시기에는 빈터였다. 이렇게 집터와 빈터 되기를 반복하였던 이 땅의 내력은 깊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일대를 가리켜 ‘독녀혈’(獨女穴)이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독녀혈은 과부가 많이 나온다는 데서 나온 말로 ‘과부골’이란 뜻이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477년 성종 때의 일이다. 전 임금 예종의 딸 현숙공주가 당시의 실력자 임원준의 손자에게 시집을 가면서 이곳에 집을 짓게 된다. 이때 호조정랑 이의(李誼)가 성종에게 “그 자리는 세종 때도 명당이란 소문이 있어 임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았던 곳인데, 공주의 집을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고 아뢴다. 이에 성종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임원준을 불러 “경의 손부 현숙공주의 집터가 제왕의 기가 서린 곳이라는데 사실인가?” 하고 직접 묻는다. 임원준은 이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세종께서 친히 가보시고는 버리신 땅입니다. 또 세상에는 이곳이 독녀혈이기 때문에 과부가 많이 나오는 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을 품고 이곳에 손부의 집을 짓겠습니까” 하고 답한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세종의 아들 수춘군이 일찍 죽어 젊은 과부가 나왔으며, 나라에 두 번씩이나 빼앗긴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에 성종은 공주 부부로 하여금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한다. 그런데 이 터가 독녀혈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숙공주의 결혼 생활은 불행으로 끝난다. 부부 사이가 나빠 공주는 집을 나와 대궐로 돌아가고, 남편은 죄를 지어 귀양 가 죽는다.
그렇다면 과부가 나는 땅에 율곡 같은 대학자가 살았던 것은 풍수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또 율곡 이후에도 여전히 독녀혈이라는 이름이 전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에 대해 영탑산사(靈塔山寺) 학암스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독녀혈은 3대에 한 번씩 큰 요동을 치는 자리로서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란 다름 아닌 여인의 자궁을 상징한다. 3대에 한 번씩 요동칠 때마다 불운이 있다. 큰 구멍은 하나의 큰 기둥을 벗삼아 살아야 하기에, 그 깊은 구멍에 큰 나무를 심어야 한다.”
사진 속의 큰 나무는 바로 그러한 까닭에 세워진 것이고 율곡과 같은 대학자는 요행히 3대에 한 번씩 요동치는 그 시기를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풍수적으로 엄밀하게 살피면 이곳으로 이어지는 산능선(來龍)에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에서 지기(地氣)는 동십자각 옆에 있는 미 대사관 숙소→한국일보→우정총국터(조계사 뒤)→서울 중앙교회→음식점‘都園’→SK 건설 빌딩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맥이 자연스럽게 꺾이지 않고 90도 이상 급격하게 가는 길을 바꾼다. 이럴 경우 풍수에서는 미친 용이란 뜻의 ‘광룡’(狂龍)으로 부른다. 즉 지나치게 강한 기운이 자기 통제를 못하고 요동을 치면서 독녀혈 부근에 기를 쏟아붓는다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땅에서 내침을 당한다.
결론적으로 율곡 같은 큰 인물이나 공공건물 혹은 큰 회사의 빌딩이 들어서야 적절한 땅이다. 모두에게 독녀혈의 소응(昭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택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성주사 돼지 석상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없다. 성주사 스님들은 50년이 넘은 것은 확실하고, 대충 잡아도 100년 전에 세워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돼지 석상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한 설들이 많다. 절터의 형상이 제비집[燕巢穴]인데 절 앞산이 제비를 노리는 뱀의 머리와 같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절에 뱀이 많아서 그랬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성주사 절터와 뱀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돼지는 살모사가 물어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뱀과 상극인 동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왠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성주사 앞산이 뱀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돼지석상을 세웠다는 것은 ‘풍수적 애교’로 보아줄 수는 있겠으나 100년 역사를 가진 돼지 석상이고 보면 그리 간단하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또 절에 뱀이 많아 돼지 석상을 세워 내쫓으려 했다는 것도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영물인 뱀이 돌 돼지에 놀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웅전 주변에 이런 조형물들이 배치된 것은 이 절터가 화기(火氣)가 강하기 때문에 물로 불을 제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화기가 많으면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1991년에 성주사에 큰 불이 있었다. 이곳에 뱀이 많다거나 앞산이 뱀 머리 산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을 상징화한 것이다. 뱀은 12지지 이론에서 불[火]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화기가 많은 곳에 절터를 잡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은 터잡기에서 공간 배치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이 절의 창건 연대가 가야 혹은 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였지만, 현재의 공간 배치구조는 지나치게 이론 풍수 혹은 남향 선호를 중시한 것으로 보아 중국 풍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남향으로 절터를 고르다 보니 물길이 빠져나가는 북서쪽이 허하게 된다. 당연히 북서풍이 절터를 강하게 치게 되며 화재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 화재가 빈발하다 보니 스님들은 화기가 강한 절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에둘러 불의 상징인 뱀이 많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또한 억지로 남향을 고집하다 보니 이 절의 우백호 끝 부분에 절터를 정하게 돼 제비집 형상이 되었던 것이다. 제비집에서 앞산 정상 부분에 뱀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대웅전을 치고 들어오니, 그것이 이 절에 불행을 가져다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애당초 터잡기에 있었다. 이곳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터는 뒷산을 등지고, 좌우 산들이 감싸주어야 할 자리다. 풍수를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성주사를 가면 그 진혈처가 어디인지 쉽게 지적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진혈처 부근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조 임금이 집권하던 1786년 12월, 왕대비 정순왕후는 다음과 같은 한글 교서를 내린다. “1786년 5월 문효세자의 사망, 9월 세자의 어머니 의빈 성씨의 죽음, 11월 상계군 담의 사망 등 왕실의 비극적 사태들이 모두 독살에 의한 것이니 빨리 역적을 찾아내라.”
1786년은 정조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해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슬픔은 나이 서른이 넘도록 자녀가 없던 정조가 뒤늦게 얻은 일점혈육 문효세자를 홍역으로 잃은 것이었다. 문제는 다섯 살 어린 나이의 세자가 홍역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독살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부터. 사실 정조는 세자가 홍역을 앓게 되자 의약청을 설치하고 자신이 친히 약을 달여 먹일 정도로 온 정성을 기울여 아들을 살려냈다. 그리고 이를 몹시 기뻐하여 대사면령을 내리고, 과거를 실시하고, 조세를 탕감해주는 등 온 나라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던 터에 갑자기 세자의 병이 악화돼 끝내 죽고 만 것이다.
이 때문에 정조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불행을 겪어야 했고, 그 자신이 왕세손으로 있을 당시에는 정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받았으며, 왕이 되고 나서도 몇 번씩이나 자객으로 인해 암살 위기에 처했던 정조였다.

그러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임신중이던 왕세자의 어머니 의빈 성씨가 그 해 9월 갑자기 사망하고 만 것이다. 또 그 해 11월 정조의 조카인 상계군 담이 갑자기 죽는다. 상계군 담은 정조의 이복아우 은언군의 아들이었다. 사도세자의 후손들이 모두 죽어 나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왕대비 정순왕후가 왕실에 더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음을 감지하고 이 같은 한글 교서를 내린 것이다.
결국 정조는 명당을 통한 ‘운명바꾸기[改天命]’를 시도한다. 그러잖아도 이전부터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나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던 터였다. 정조는 고모부인 박명원(화평옹주의 남편)과 지관 차학모(車學模)를 대동하고 사도세자의 무덤(현재 서울시립대 내에 위치)을 둘러본 뒤 그곳이 흉지임을 확인하고 이장을 준비한다.
그러나 이장하는 데 좋은 날을 잡지 못하여 무려 3년을 기다린 끝에 정조 13년 마침내 수원으로 이장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현재 무덤인 융릉이다. 이 자리는 고산 윤선도가 일찍이 ‘천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최고의 명당’으로 평가한 자리였다. 이른바 엎드린 용이 여의주를 갖고 노는 반룡롱주형(盤龍弄珠形)의 명당.
사도세자의 무덤을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이장하고, 정조는 주역으로 점을 치게 한다. 괘가 겸괘(謙卦) 오효(五爻)로 나왔다. 이 괘는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조만간 국가의 경사(즉 자손을 두는 것)가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이장한 그 이듬해인 1790년 6월에 수빈 박씨가 왕자를 낳는다. 바로 11세의 나이로 임금 자리에 올라 34년간 왕위를 지킨 순조 임금이다. 아무튼 순조를 얻은 것이 명당의 발복 덕분이라 생각한 정조는 더욱더 자주 융릉을 참배한다. 나아가 그는 융릉을 위해 성을 쌓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이다.
이렇듯 수원 화성은 자신에게 아들을 안겨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의 보존과 자신이 융릉을 참배할 때 머물 행궁(行宮)이라는 1차적인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 때의 대신 김종수(金鐘秀)가 쓴 화성기적비(華城紀積碑)에도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화성이 건립된 1차적 목적은 풍수적 이유였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상행하다 보면 고찰 보경사(寶鏡寺)라는 팻말이 눈에 띄는데, 이 팻말을 쫓아 보경사 입구로 한참 들어가면 송라면 중산1리 마을을 만난다. 이곳 마을회관 앞에는 작은 돼지, 큰 돼지가 일렬로 늘어서 마을 뒷산을 쏘아보고 있어 흥미를 끈다. 물론 살아 있는 돼지가 아니라 석상이다. 1990년 초에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세웠는데 그것만으로는 기세가 약할 듯해 6년 후인 96년 8월23일 마을 부녀회에서 그보다 큰 돼지 한 마리를 다시 세웠다 한다.
왜 세웠을까? “사람들에게 운이 있어 흥망이 교차하듯 마을에도 운이 있다.” 중산1리 이원기 이장(56)의 말이다.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의 다른 표현인데, 이어지는 이장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마을 운이 사나웠던지 80년대 중반에 젊은이들이 줄줄이 죽어 나갔다. 게다가 마을 기운도 갈수록 쇠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동네 터가 뱀혈[巳穴]이라서 뱀이 동네를 해롭게 하고 있으니, 뱀이 질색하는 돼지 석상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돼지 한 마리를 세웠는데 그다지 효험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더 큰 돼지 한 마리를 세웠다. 그렇게 돼지 두 마리를 세우고 나서 마을이 안정이 되었다.”

화기(火氣)인 뱀을 제압할 수 있는 짐승은 수기(水氣)인 돼지라는 점은 창원 성주사 풍수 편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을 역시 성주사 터처럼 불기운이 강해서 그러한 화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세를 살펴보면 작은 돼지, 큰 돼지가 일렬로 서서 바라보는 곳이 건주봉으로 이 동네의 주산, 즉 진산(眞山)이다.
건주봉의 산능선은 뱀의 굵은 몸통처럼 이어져 내려와 동네를 감싸고 있다. 풍수상 마을 형세는 소쿠리 명당, 즉 ‘와혈(窩穴)’이다. 따라서 마을의 진혈처는 소쿠리 안이 된다. 전통적으로 소쿠리 안에 해당되는 곳에는 부잣집들이 많았다.
한편으로 이 마을 터를 뱀혈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소쿠리의 굵은 테두리를 특징화한 것이다. 소쿠리의 테두리는 마을의 경계선이자, 와혈일 경우 현릉사(弦稜砂)에 해당된다. 이 마을의 현릉사는 마을 터의 오른쪽 테두리선인데, 오른쪽은 여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힘을 발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돼지 석상 건립을 주관한 것이 마을 부녀회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중산1리의 또 다른 특징은 현릉사와 개천을 경계로 삼아 평행하게 이어지는 우백호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 이런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중산1리의 200년 역사에 버금가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백호 자리에 들어서 있다. 이른바 비보수(秘保樹)로 마을을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마을은 왜 80년대 중반에 불운을 겪어야 했을까.
이 마을은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새마을운동 때문에 공간을 재구성하게 됐다. 삼륜 트럭과 경운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구의 도입으로 인해 80년대에 동네 고샅길을 넓혀야 했고,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적게는 대여섯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에 이르는 가축들을 키우게 되면서 집터를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 과정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까지 건드림으로써 마을에 흉운을 불러들였다. 즉 소쿠리 명당의 진혈을 훼손시킴으로써 마을의 기운이 쇠하고, 동네 젊은이들의 흉사까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마을이 쇠락하게 됐던 것은 결코 땅의 재앙만은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격히 몰락하는 농촌사회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세대가 바로 농촌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산업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고난과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중산1리 마을의 부녀회에서 돼지석상 건립을 주관했다는 사실에서, 남편과 자식들의 좌절과 절망 그리고 죽음을 위로해주고자 했던 여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돼지 석상을 세우고 나서 이 마을에 재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걸씨를 비롯해 여러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출세를 도모하다 얼마 전 구속된 최규선씨. 권력과 부를 거머쥐려 했던 그는 2001년 4월 선영을 전남 영암으로 이장해 명당 기운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감옥으로 가고 말았다.
조상의 묘를 명당으로 옮김으로써 발복(發福)을 기원하려는 시도는 특히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인 2001년에 눈에 띄게 많았다. 그 해 6월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부모 선영을 충남 예산으로 옮겼고, 얼마 뒤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목포에서 충남으로 부모 선영을 옮겼다.
이 같은 정치인들의 선영 이장은 이미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었으며 선영 이장에 얽힌 일화또한 많은데 그중 건축사이자 풍수지리 연구가인 박시익씨의 일화가 특히 유명하다.
한양대 공대를 졸업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박씨는 주택설계가 끝난 후 의뢰인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람에 난감했던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풍수지리적 이유를 들며 다시 설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때까지 풍수설을 미신으로 치부했던 박씨는 이런 경험을 계기로 풍수지리에 대한 호기심을 품게 되어 풍수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서 점차 명당 발복론을 확신하게 된 그는 ‘만약 죽은 사람이 명당에 들어가 그 후손이 발복을 받는다면, 산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산다 해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풍수 공부를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당시 서울 종로구의 집을 판 뒤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경기 남양주군 사릉(조선 단종비의 무덤) 부근에 있는 1000평 규모의 산을 샀다.
박씨는 명당 혈이 있는 지점의 땅을 시신을 안치할 때와 같은 깊이로 파내고, 그 위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비닐을 덮어 움막을 만든 후 그곳에서 기거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장공비 들어라! 너는 완전히 포위되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놀란 그가 잠에서 깨어나 움막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예비군, 경찰들이 사방을 포위한 채 움막 쪽으로 총구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얼떨결에 손을 들고 나와 ‘체포’되었다. 경찰서로 끌려간 그는 ‘생포된 간첩’이었다.
알고 보니 그를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간첩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잠복근무를 하면서 박씨가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핀 뒤 간첩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자 그를 ‘생포’한 것이다. 연락을 받은 부인이 경찰서로 달려왔지만 간첩 누명을 벗기지는 못했다.
며칠을 고생한 뒤 그는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시 권상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권실장과는 풍수 공부를 함께 한 인연이 있었던 것. 사태를 파악한 권실장의 신원보증으로 박씨는 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누가 중간에 다리를 놓았는지 고위 권력층에서 그 땅을 사겠다고 접선해온 것. 알고 보니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다. 계약은 땅을 소개해준 사람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부장이 직접 오지는 않고 부인인지 며느리인지 한 여인이 왔다. 그래서 당시 박씨가 ‘명당 실험’을 하던 자리에는 이후락씨의 어머니가 안장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이다.
그 후 박씨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7년 ‘풍수지리설 발생 배경에 관한 분석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는 영남대 대학원에서 풍수학을 강의하고 있다.

▼기차가 개바위를 피해 달리고 있다.
▶ 개바위 뒤에 그 사연을 적어 넣은 표석이 보인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양안이 마을 앞으로는 경부선이 지나고, 경부선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탄약창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있다. 그리고 두 철로 사이에는 노거수(老巨樹)와 바위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일명 ‘개바위(狗岩)’다. 바위들 중 큰 것은 어미 개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둥글둥글한 작은 바위들은 강아지들을 연상시킨다. 이곳에는 ‘구암사적(狗岩事蹟)’이라는 표석도 있는데, 표석에 씌어진 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의 이씨 시조인 태사공 도(全義李氏太師公諱棹)의 묘소는 풍수상 엎드린 호랑이 형상(伏虎形)이라 한다. 묘소의 북동쪽(寅方)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어미 개가 강아지를 거느리고 있는 형상의 바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엎드린 호랑이의 먹이로서 명당의 필수인 개바위이며, 우리 전의 이씨 자손들이 소중히 여겨온 것이다. 1902년 경부선 철도와 1909년 탄약창 철도 부설 당시 전의 이씨 모두가 뜻을 합해 이 개바위를 철거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보존할 정도로 전의 이씨가 영원히 후세에 전하는 유적이다. 경오년(庚午年) 6월 전의 이씨 화수회 본부.’
단지 바위 몇 개를 지키기 위해 전의 이씨 종중 전체가 나섰고, 지금까지 100년 넘게 보존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바위 옆으로는 1번 국도도 지나간다.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됐을 당시 사라질 위기도 맞이했을 터이지만, 개바위는 의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의 이씨 문중에서는 왜 이렇게 개바위를 소중하게 여길까? 표석의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전의 이씨 시조인 태사공 이도(李棹)의 묘 때문이다. 현재 전의 이씨 문중은 시조묘의 명당 발복 덕분에 자손이 번창하고 명문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호랑이 형상의 명당론이 자주 등장한다. 풍수 형국론(물형론)에 의하면 ‘사나운 호랑이가 숲을 나올 때 그 앞에 개가 누워 있는 형상(猛虎出林臥犬形)’이 가장 이상적인 명당이다. 사나운 호랑이 형상의 산은 산세가 웅장할 뿐만 아니라 강한 기운이 엿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곳 전의 이씨 시조묘는 낮은 산언덕 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산세도 부드럽다. 따라서 이곳 명당을 사나운 호랑이가 숲을 뛰쳐나오는 형상(猛虎出林形)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사나운 호랑이라면 그 500m 전방에 있는 개가 불안할 것이며, 결국 이곳은 불안한 땅이 되고 만다.
이곳은 호랑이가 느긋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복호형(伏虎形)이다. 호랑이가 느긋하게 엎드려 있다는 것은 배가 부르다는 뜻이다. 전방에서 강아지들에게 젖을 주고 있는 어미 개도 배부른 호랑이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호랑이도 느긋하고 새끼를 거느린 어미 개도 편안하다. 그렇지만 호랑이와 개는 서로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이곳이 좋은 땅인 이유다.
이 때문에 전의 이씨 문중에서 개바위를 소중하게 다루어왔고, 경부선 철도뿐만 아니라 1번 국도의 노선도 바꾸게 한 것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거나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전의 이씨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개바위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풍수 답사는 주로 권력자 혹은 갑부들의 집터나 무덤터를 대상으로 한다. 풍수인들은 특히 갑작스럽게 권력을 장악하거나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선영이나 집터를 즐겨 찾는다. 명당 발복(發福)이 아니라면 그 터의 주인공이 그렇게 갑자기 출세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한 땅을 답사해보면 대개 지나친 살기(煞氣)와 탁기(濁氣) 그리고 강기(剛氣)가 뒤섞여 있다. 그러한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다.
흔히 진짜 명당은 훌륭한 인물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걸지령론(人傑地靈論)은 단지 동양의 풍수적 사고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엿볼 수 있는 관념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독일의 전쟁영웅 슐라게터를 위한 추도연설에서 “젊은 농부의 아들 슐라게터가 성장했던 곳의 산들은 원생암석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 슐라게터가 가졌던 강인한 의지는 옛날부터 그 산들에 의해서 길러져 왔다”고 말한 바 있다.
과연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훌륭한 인물은 누굴까? 김수환 추기경과 열반에 든 성철 종정은 가톨릭과 불교의 수장이라는 종교적 한계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시대의 훌륭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철 종정은 생전에 추기경을 늘 칭찬하였으며, 추기경 역시 종정의 청빈한 생활과 수도 자세를 칭찬하였다고 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었음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경받는 종정과 추기경을 길러낸 땅들은 어떤 땅일까? 성철 종정의 생가는 한때 “산수갑산 다음으로 오지”라고 불리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마을이며, 추기경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 역시 경북의 오지인 군위읍 용대리다. 지리산과 팔공산의 끝자락에 자리한, 두 명의 위대한 현인이 난 터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째, 소위 풍수가들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명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멀지 않은 곳에 물길이 합쳐지는 합수처(合水處)가 있다는 점이다. 즉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뜻이다. 셋째, 일반 풍수에서 말하는 객수(客水)가 집터를 감싸고 돌지 않고 등을 보이며 흘러들어와 흘러나간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풍수 술사들은 재물이나 여인 복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두 분은 여인과 재물을 멀리하였으니 맞는 말이다.
이와 같은 땅은 세속의 편안함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땅이다. 그러한 까닭에 종정의 생가는 생전에 아무도 살지 않고 잡초가 우거진 채 내버려져 있었다. 추기경의 옛집 역시 잡초 속에 기울어져 가고 있다. 여기저기에 나뒹구는 옹기 조각들만이 이곳에서 추기경 부모가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했음을 짐작케 해준다.
물론 두 현인의 생가에는 차이점도 있다. 추기경 생가 주변의 산들은 모두 토성(土星·一자 모양의 산)의 산들로서 한없이 부드럽다. 반면 성철 종정 생가 주변의 산들은 지리산의 강한 기운이 박환(剝換·기운이 바뀌는 것)되지 않은 탓인지 강한 성격을 드러낸다. 종정 입적 후 종정의 생가가 복원되어 커다란 종정의 입상이 들어섰으며 그 옆으로는 겁외사(劫外寺)라는 절이 새로 생겼다. 종정의 생전의 언행으로 보아 과연 그것이 바람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반면에 추기경 가족이 떠난 옛집은 그 아랫집 강점봉씨(65)가 사들여 얼마 전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추기경 고택 복원’을 추진한다는 성당 신자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고택이 복원되더라도 청빈한 추기경에 어울리게 현재의 원형 그대로 ‘보수(補修)’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역사적으로 어느 한 시대의 풍수 행태를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건전한지 아니면 몰락하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그 좋은 사례로 구한말 명성황후(민비)의 풍수 행태를 꼽을 수 있다.
그 전말은 이러하다. 1866년 경기 여주에서 계모와 단둘이 살던 가난한 처녀가 왕비로 간택됐다. 훗날 명성황후로 역사에 기록되는 그녀는 그러나 왕비가 된 후에도 그다지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녀에게 닥친 첫번째 불행은 왕비인 자신보다 상궁이 먼저 왕자를 생산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까지 그 왕자를 애지중지하며 감싸는 바람에 그녀는 질투심과 조바심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왕비가 대통을 이을 왕자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궁내 권력구도에서 왕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민비는 갖은 노력 끝에 1871년 그토록 고대하던 왕자를 낳았다. 그러나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어 생후 며칠 만에 결국 죽고 말았다. 이에 속히 둘째 왕자를 낳고 싶었던 명성황후는 전국의 명산대천 곳곳에 제를 드리게 하고,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였다.
민비가 무속과 잡술을 맹신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에서 드러난다. 왕실과 친하게 지냈던 언더우드(H. G. Underwood) 부인의 기록에도 나와 있고, 구한말의 대표적 지식인 황현(黃玹)은 이를 비꼬아 당시 조선을 “귀신의 나라(鬼國)”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남편인 고종조차도 임오군란(1882) 후 여덟 가지 죄목을 들어 자신의 부덕함을 자책했을 때 “궁궐이 정숙지 못하여 부녀자(민비를 가리킴)가 치성을 자주 하니 이것이 나의 죄”라고 했을 정도였다.
민비는 풍수에도 광신적인 집착을 보였다. 민비의 친정아버지 민치록은 1858년 여주 금교리에 안장되었는데, 민비는 1866년부터 자신이 시해당하기 1년 전인 1894년까지 28년 동안 무려 네 번이나 친정아버지의 무덤을 옮겼다. 여주→제천→이천→광주(廣州)→보령 순서로 7년에 한 번꼴로 이장하였던 것. 마지막 이장지인 충남 보령의 무덤 터는 당시 충청도 수군절도사 이봉구(李鳳九)가 천하의 명당이라고 소개한 곳이었다.
일반 서민이나 사대부의 경우에는 네 번 이장하는 것이 별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왕실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과거 풍수설에서는 주산에서 이어지는 내룡(來龍)과 무덤 주변의 사방을 둘러싸는 사신사(四神砂·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중시했기 때문에 왕가가 무덤을 쓸 경우 다른 사람들은 일절 그 주변에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이 법규는 ‘용호내금양처(龍虎內禁養處)’라는 말로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도 명기될 정도였다.
게다가 무덤 일대는 ‘사패지(賜牌地·나라에서 내려주던 땅)’가 되어, 백성들은 토지를 징발당하고 부역에 동원된다. 이때 징발당하는 범위가 ‘묘지에서 앉거나 서서 보이는 곳(坐立見處)’ 혹은 ‘눕거나 서서 보이는 곳(臥立見處)’인데,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곳은 모두 ‘사패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민비가 이장을 네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샀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 보령으로 이장한 지 1년 후인 1895년 민비는 일본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명성황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풍수에 대한 그녀의 신봉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풍수의 고전인 ‘발미론(發微論)’에서는 이러한 풍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나쁜 업보가 가득하면 하늘은 반드시 나쁜 땅으로 대응하는데, 그 자손이 화를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다.”
실제로 명성황후의 친정아버지 무덤은 언뜻 보아 ‘천하의 명당’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짓 명당(虛花)’에 지나지 않는다. 민비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의 몰락을 상징하는 조선 왕실 최후의 풍수 추태로 기록될 일이다.

풍수 용어 가운데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이란 말이 있다. ‘호랑이는 코끼리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쥐를, 쥐는 고양이를, 고양이는 개를, 개는 호랑이를, 호랑이는 코끼리를 무서워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동물들의 천적관계를 땅에 유비(類比)해 마치 ‘다섯 짐승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형세’의 땅은 한마디로 기(氣)가 충만한, 좋은 땅으로 본다.
그런데 ‘오수부동격’의 명당은 다섯 짐승 가운데 어느 하나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경남 진주시 대곡면 중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갑작스럽게 저승사자가 찾아온 것은 1990년대 초였다. 저승사자는 2년 동안 무려 30여명의 마을사람을 저세상으로 데려갔다. 200여명에 불과한 마을 인구 가운데 30명이나 죽어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떨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물에 빠져 죽거나, 차에 치여 죽거나, 자다가 갑자기 죽는 등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계속되어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불행의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 애썼다. 마을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던 사람들은 강 건너편의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물론 이는 실제 호랑이가 아니라 산을 호랑이로 여긴 풍수적 진단이었다.
사람들은 강 건너 ‘월아산(달음산)’을 ‘엎드린 호랑이(伏虎形)’ 혹은 ‘잠자는 호랑이(宿虎形)’로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석산(石山)을 개발하면서 호랑이 머리 부분이 깨진 것이었다. 분노한 호랑이의 저주였을까? 호랑이가 고통에 포효할 때마다 ‘때 아닌 우박에 떨어지는 풋과일’(동네 사람들의 표현)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풍수서에 ‘조산(朝山)은 불가파두(不可破頭)요, 안산은 불가파안(不可破顔)’이란 말이 있다. 조산(앞산)은 머리가 깨져서는 안 되며, 안산은 얼굴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호랑이 머리 모양의 월아산은 이 마을의 조산에 해당되는데 바로 그 머리가 깨진 것이다.
1995년 추석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관 앞에 코끼리 석상 한 쌍을 세웠다. 이후 더 이상 불행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를 중간에 내세워 성난 호랑이를 진정시킨 것이다.
그런데 인근 마을은 호랑이의 보복을 피했는데 왜 유독 중촌만 화를 입었을까. 중촌은 풍수상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에 주산이 없는 데다 마을 뒷산들은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내려오는 산룡(散龍)의 형세며, 마을 터 또한 산의 얼굴(面)이 아니라 등(背) 쪽에 자리하고 있다. 소위 기(氣)가 흩어지는 곳이다.
그럼에도 몇 백년의 마을 역사를 이어온 것은 이곳 사람들의 뛰어난 풍수적 지혜 덕분이었다. 마을 앞에다 비보수(당산나무)를 심었고 집의 방향과 크기조차 함부로 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마을 앞으로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게다가 주택 개량사업으로 기존 집터와 집의 모양, 대문의 방위가 바뀐 데다 결정적으로 석산 회사가 강 건너 호랑이 얼굴을 깨뜨리면서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무튼 코끼리상을 세운 이후 중촌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다. 이처럼 때로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화(禍)를 피해갈 수 있다. 바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려는 풍수적 지혜인 것이다.

충청도 양반’ 하면 흔히 ‘점잖은 사람’의 대명사처럼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충청남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한용운,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등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 사실 충남 지방의 산세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위엄과 강기(剛氣)를 지닌 땅’이라는 게 공통적인 품평이다. 점잖음과 굳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충남이 배출한 숱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아직도 입에 담기를 꺼리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가 배척한 박헌영이 바로 그다. 1900년 5월1일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서 영해 박씨 박현주와 서산 출신의 이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박헌영은 첩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인 박현주가 본처와의 사이에 열 살 난 아들을 두었음에도 집안에 딸이 없다는 이유로 첩을 들였던 것. 그러나 첩은 딸이 아닌 아들 헌영을 낳았다.
박헌영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나와 경성고보(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때 미국 유학도 꿈꾸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면서 공산주의자의 길을 걷게 됐다. 1945년 광복 이후 남로당 당수를 지냈고 월북해서는 북한 부수상까지 지냈으나 1955년 김일성에 의해 처형당하고 만다.
현재 그의 고향인 예산군 신양면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면사무소에 그의 호적이 없는 데다 친척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박헌영으로 인해 집안 전체가 ‘멸문’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해 박씨 문중에서 1966년 족보를 다시 만들 때도 박헌영이란 이름을 족보에서 지워버렸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박헌영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그러한 까닭에 그의 생가조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예산군 신양면 죽천2구라고도 하고, 신양면 면소재지라고도 한다. 확실한 것은 죽천2구가 원래 박헌영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고, 신양면 소재지는 박헌영의 어머니가 본가에서 나와 주막집을 차렸던 곳이라는 점이다.
박헌영의 고향을 답사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죽천2구와 이웃해 있는 죽천1구 마을회관 앞에 양(羊) 석상 하나가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마을사람들은 어느 문중에서 무덤 석상으로 쓰다가 버린 것을 주워와 회관 입구에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입지를 보면 우연 이상의 어떤 상징이 담겨 있는 듯하다. 우선 양 석상이 정확하게 박헌영의 고향마을인 죽천2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방향이 미방(未方)이다. 미는 십이지상 양(羊)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영해 박씨 문중뿐 아니라 고향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한 세기의 말썽꾸러기”(박갑동씨의 표현)에게 ‘순한 양이 돼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을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을 ‘말(馬)’이라고 한다는 점이다. 왜 말로 표현할까?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를 겪었던 고향사람들은 그가 1900년 경자(庚子)생 쥐띠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쥐를 상징하는 십이지의 ‘자(子)’는 말을 상징하는 ‘오(午)’와 상극관계다. 박헌영의 기운을 눌러서 이기라는 의미일 수 있다.
물론 양 석상을 세운 것도, 양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미향(未向)인 것도, 또 양을 말로 생각하는 것도 모두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풍수는 땅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빚어지는 숱한 사연들이 어떻게 현상(現象)하는가를 살피는 학문이다. 그래서 풍수가의 눈에는 박헌영의 고향마을을 바라보는 양 석상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박헌영으로 인한 상처의 반영으로 보이는 것이다.

가슴에 ‘4H’ 표시를 달고 있는 바위를 이곳 사람들은 ‘개구리 바위’라 부른다. 개구리 모습과 흡사하다 하여 그렇게 이름붙여진 이 바위는, 그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100년 전에 쌀 20가마 값에 해당하는 값비싼 바위였다.
지금은 쌀 한 가마에 20만원이 채 안 되지만 1900년대 초만 해도 머슴이 주인집에서 1년 동안 일해주고 받은 품삯이 쌀 10가마 안팎이었다. 그러니 당시의 개구리 바위는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맞먹는 값이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개구리 바위가 그렇게 귀하게 취급됐을까.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남원 양씨(南原梁氏) 가문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소재지 부근에 사두혈(巳頭穴) 명당을 구했다. ‘뱀머리 명당’이란 뜻의 사두혈은 주산에서 길게 뻗어 내려오던 산 능선이 평지에서 물길을 만나 멈춘 지세를 말한다. 마치 산에 있는 뱀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들판으로 내려오는 형상과 같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산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이 길면 긴 뱀, 즉 장사(長蛇)가 된다고도 한다.
뱀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개구리·쥐 등으로, 먹이를 찾지 못한 뱀은 굶주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먹이를 찾은 뱀은 배불리 먹고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뱀머리 명당은 무덤 앞에 반드시 개구리나 쥐 형상의 안산이 있어야 한다. 또 안산이 너무 작으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커도 먹을 수가 없으며, 너무 멀어도 잡아먹을 수 없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크기의 것이 있어야 한다.
남원 양씨 문중에서 잡은 명당 앞에 서 있는 개구리 바위는 그야말로 개구리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나 거리도 뱀이 노리기에 아주 적당하였다. 당연히 개구리를 노리는 뱀의 기가 온통 머리로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형국을 긴 뱀이 개구리를 쫓는 형세, 즉 ‘장사추와형(長蛇趨蛙形)’의 명당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뱀의 머리 부분에 무덤을 써야 한다. 민간에서 통용되는 묘지 풍수 관념에 따르면 개구리를 노리는 뱀의 온 신경이 머리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풍수고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낭경’이나 ‘인자수지’ 등에서는 산 능선을 크게 지룡(支龍)과 롱룡(壟龍)으로 나누는데, 롱룡은 산세가 분명하면서 웅장한 산 능선을 말하고, 지룡은 평지의 얕은 능선을 가리킨다. 전자는 산 능선이 끝나는 부분, 즉 발(足) 부위에 터를 잡아야 하고, 후자에 터를 잡을 때에는 머리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원 양씨 문중에서는 긴 뱀의 땅을 찾아 명당혈을 얻었으나, 그 앞의 개구리 바위까지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이 개구리 바위를 없애버리면 후손들이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문중에서 쌀 20가마를 주고 개구리 바위만을 샀던 것이다.
1980년대 무덤 앞으로 길이 나면서 개구리 바위가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문중의 흥망이 달린 일이었다. 결국 문중에서 일치단결하여 개구리 바위를 우회해 도로가 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뱀과 개구리의 팽팽한 긴장관계는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남원 양씨 문중은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믿는다

오성과 한음. 조선 선조 때 명신(名臣)이자 일화가 많은 친구 사이였던 백사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일컫는 말이다. 이 가운데 이덕형과 관련해서는 풍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이덕형이 토정 이지함의 조카사위이기 때문이다.
토정이 경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약, 복서(卜筮) 등에도 능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훗날 그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서 ‘토정비결’이란 책이 나올 정도였다. 풍수지리와 사주는 물론 관상에도 능했던 토정은 조카인 이산해(훗날 영의정을 지냄)의 딸을 이덕형과 결혼시키도록 했다. 이덕형의 관상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덕형은 38세에 좌의정에 올라 죽기 1년 전인 52세까지 영의정과 좌의정을 번갈아 지낸 인물이니 토정의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신묘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토정 가문에서는 토정보다는 그의 형님(이지번)을 비롯해 그 윗대 어른들이 더 천문, 지리, 복서에 능통했다. 토정과 그 일족이 묻힌 곳도 바로 토정의 형님이 잡아놓은 자리라고 한다. 어쨌든 토정 집안의 풍수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처가의 이러한 집안 내력 때문인지 이덕형은 처가 문중이 명당을 써서 집안이 흥성(興盛)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던 듯하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과 명당 발복에 대해 논쟁을 벌이던 이덕형은 한 사람이 풍수의 허황됨을 주장하자 다음과 같이 논박했다(이산해의 14대 후손 이항복 전 예산문화원장의 증언).
“명당 발복은 있다. 진혈(眞穴)을 못 찾아서 그렇지, 진혈만 찾으면 발복한다. 우리 처갓집을 보라!”
실제 이덕형은 처갓집의 명당 발복과 관련해 그의 주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기록[죽창한화(竹窓閑話)]도 전해진다.
“내가 일찍이 처갓집 선영이 있는 고만산(충남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에서 지관들의 평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수십년 후에 확인해보니 귀신처럼 맞더라. 풍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덕형이 언급한 고만산에는 토정 이지함과 그의 조상, 그리고 토정 아들들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덕형이 풍수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왕조실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명지관으로 활약하였던 스님 성지(性智)와 빈번하게 교류하였다고 전해진다. 성지 스님은 광해군 때 궁궐의 터를 잡는 데 관여해 광해군의 신임을 얻었으나 광해군의 실각과 더불어 죽임을 당한 지관이었다.
이덕형은 명당을 고르는 일에도 직접 나선 적이 있다. 이덕형의 장인이자 토정의 조카인 이산해가 죽자 충남 예산 대솔면 안골에 안장하는데, 이때 조정에서 예장(禮葬)을 위해 파견한 관리가 바로 이덕형이었던 것. 따라서 이 자리는 토정 가문의 풍수적 지식과 이덕형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산해의 무덤이 있는 마을 입구에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흙으로 만든 3개의 작은 섬이 있으며, 그 위에 나무가 한 그루씩 자라고 있다. 흔히 이것을 삼신도(三神島)라고 하여 도가(道家)의 흔적으로 본다. “이산해의 글 가운데 선경(仙境)을 동경하는 글이 많아서 삼신도를 만들었다”는 게 이산해 후손의 말이다.
그러나 풍수적 안목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풍수무전미(風水無全美)’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흠 없는 명당은 없다’는 뜻이다. 이곳 역시 흠이 적지 않은 곳이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삼신도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무덤에도 비보(裨補) 풍수가 가능하다는 예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선양(瀋陽)에 끌려갔다 오기도 했다. 한문학에 정통하여 조선 중기 한학 사대가의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풍수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 20대 후반에 전북 고부에 안장된 할아버지 묘를 직접 경기 양평으로 이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풍수를 중시했던 것은 비단 택당뿐 아니라 조선조 유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그렇다면 성리학 이외의 그 어떤 학문도 배척했던 조선 지식층에서 왜 풍수만은 그리도 중시했을까? 이는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유교는 그 실천윤리의 하나로 효를 매우 강조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살아 계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을 효행의 근본으로 삼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좋은 땅에 모시는 것 역시 효행의 덕목 중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두 번째로 유가(儒家)의 생사의식(生死意識)도 풍수와 결부돼 있었다. 명당에 조상을 모시면 후손이 번창하고, 그렇게 되면 제사가 끊이지 않아 조상이 후손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조선조 사대부들은 풍수를 거의 종교와도 같이 신봉했다.
아무튼 택당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조부 묘를 이장한 곳은 경기 양평군 양동면 백아골.
광해군 당시의 명풍수 이의신이 소개한 명당자리였다. 이의신은 광해군에게 도읍지를 한양에서 파주군 교하면으로 옮길 것을 건의(교하천도론)하여 당시 조정을 발칵 뒤집어놓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택당은 이의신 외에도 당대의 유명 풍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조부 묘에 대해 자문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수군제독 진린(陳璘)의 참모였던 두사충, 선조의 신임을 얻어 서울 동대문 밖의 동묘(관묘) 터를 잡았던 박상의, 인조의 어머니 인헌왕후 무덤자리를 잡았던 오세준이 바로 그들로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국가 최고의 명풍수로 꼽히던 인물들이었다.
이때 택당의 초빙을 받은 4명의 국풍(國風) 사이에서는 혈(穴)의 종류에 대한 재미있는 논쟁도 벌어졌다. 도대체 혈이 무엇이며, 왜 그에 관한 논쟁이 기록에 남게 되었을까?
혈이란 유골이 안치될 정확한 지점과 방향을 말한다. 좋은 땅은 혈의 모양이 일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크게 와겸유돌(窩鉗乳突) 네 가지로 나누어 사상(四象)이라고도 한다. 실력 있는 풍수는 혈을 식별할 줄 알고, 그 혈을 사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성리학의 대가이자 풍수에도 능했던 주자(朱子)는 “무덤에서의 혈은 침 놓을 혈자리와 같아 터럭만큼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로 이 혈을 두고 두사충, 이의신, 박상의, 오세준 등 당대의 국풍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택당의 조부 묘자리에 대해 와혈이니, 겸혈이니, 유혈이니 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던 것. 최고의 실력을 갖춘 국풍들이 혈상을 구분하는 데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을까?
사실 이는 고려의 풍수와 조선의 풍수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고려의 풍수는 ‘국역 풍수’로 세세한 묘지 풍수를 중시하지 않았던 반면, 조선의 풍수는 효를 강조하는 윤리의식과 묘지 풍수가 강조됐다. 더욱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풍수들이 들어오면서 묘지 풍수는 더욱더 정밀해졌다. 중국의 묘지 풍수 역시 16세기 중엽에야 정교한 모습을 갖추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당시 조선 풍수들은 그것이 진혈(眞穴)임을 알고서도 사물(穴)과 언어(穴名)를 제대로 대응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어쨌든 택당은 이 자리에 조부 묘를 이장했고, 이 명당 덕분에 ‘3정승 6판서가 나왔다’고 후손들은 믿고 있다.

마을이나 도시들 가운데 배(舟) 모양을 한 지형을 행주형(行舟形)이라고 한다. 행주형은 무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마을이나 도시 같은 양기(陽基) 풍수에만 보인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식수와 농업용수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촌락이나 중·소·대도시는 자연스럽게 물가에 형성되었다.
행주형은 삼면이 강이나 개천으로 둘러싸인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주형 마을로 안동 하회마을과 예천 의성포, 대구 팔공산 너머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행주형 마을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주요 도시로는 나주, 청주, 북한의 평양 등을 꼽을 수 있다.
행주형은 배 모양의 지형이므로 키, 돛대, 닻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아주 좋은 명당으로 치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갖추어도 좋은 땅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것들을 연상시키는 자연물이 없을 경우 인위적으로 세워놓기도 한다.
이를테면 나주와 청주의 석당간은 바로 돛대를 상징하는 비보(裨補) 풍수물이다. 배를 머물게 하는 의미로 닻을 상징하는 쇳덩이를 강물 속에 내려놓기도 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평양 연광정 앞의 깊은 물 속에 닻을 내려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1923년 가뭄 때 물이 마르자 실제 그곳에서 큰 쇳덩이가 나와 그 전설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행주형 마을이나 도시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속설이 있다. 배에 구멍이 뚫리면 배가 침몰하듯, 마을에 우물을 파면 마을이 망한다는 설이다. 그래서 행주형 마을에서는 절대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다. 이런 풍수설화가 현대인들에게는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행주형의 경우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땅이 사토질로 돼 있어 지반이 매우 약하다. 때문에 이런 곳에 샘을 파면 주변의 강물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반의 침하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
옛사람들이 그런 땅의 성격을 파악하고 행주형에 빗대어서 경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풍수 논리를 전제하지 않고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윤홍기 교수(풍수학)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왜 서울의 한강 물이나 조선시대의 다른 도시들에 위치한 강물이 아닌 평양의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문제는 평양이 풍수적으로 볼 때 배가 둥둥 떠가는 모양(行舟形)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중략) 행주형인 평양에서는 주민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물을 파는 것을 금기시해 강물을 길러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서울의 한강 물이 아닌 평양의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모 대학의 S 풍수학 교수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에 대해 마치 자기가 처음 해석한 것처럼 발표하여 표절 시비가 있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홍기 교수가 가장 먼저 자신의 논문에서 ‘봉이 김선달’에 대해 해석했다. 풍수가 점차 학문으로 인정받다 보니 대동강 물이 아닌 ‘남의 논문을 팔아먹는 선달’들도 하나둘씩 생기는 분위기다.

조선시대 명풍수로서 숱한 전설을 남긴 이 가운데 두사충(杜師忠)이란 인물이 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돕기 위해 중국에서 온 섭정국, 시문용, 이문통 등과 같은 풍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지리에 밝아 명나라 군대의 ‘진지와 병영 위치 선정(屯軍置營)’ 참모로 활동하다가 더러는 귀국하고, 더러는 조선에 눌러앉았다. 이들로 인해 조선 중기 이후 한반도 풍수, 특히 묘지 풍수 양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두사충은 생전에 경기 양평에 있는 한학사대가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조부묘를 감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 그는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무덤을 정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그 전설이 아직까지도 전해오고 있으며, 그가 잡지 않은 자리까지도 ‘두사충이 소점한 자리’라고 전해지는 곳이 많다.
두사충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21대 후손이었다(두사충의 11대 후손인 고 두재규 선생이 증언했다). 그는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의 처남으로, 복야(僕射·중국 당·송시대의 재상)로서 진린을 따라 조선에 왔다. 수군이었던 진린 도독이 이순신 장군과 자주 만났는데 이때 두사충도 이순신 장군과 친교를 맺었다. 이순신 장군이 두사충에게 준 ‘봉정두복야(奉呈杜僕射)’라는 시가 아직까지 전해진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귀국했던 두사충은 정유재란(1597)이 발발하자 다시 조선에 온다. 이때 그는 조선에 가지 않겠다는 부인을 혼자 중국에 남겨두고 두 아들만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으로 영영 부인과는 이별하고 말았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진린 도독이 귀국하려 하자 두사충은 “도독은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이니 되돌아가야겠지만 나는 이곳에 남겠다”며 작별인사를 했다. 이미 명나라가 망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가 대구에 정착해 ‘고국 명나라를 잊지 않고 섬긴다’는 뜻에서 ‘대명(大明)’이란 지명을 붙이고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현재의 ‘대명동’이다. ‘대명동’이란 지명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도 있는데 이 역시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들어와 귀화한 풍수 시문용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붙인 지명이다. 시문용은 광해군 당시 실세 정인홍의 추천으로 한양에 올라가 궁궐터 소점에 관여한 풍수로 유명하다.
대구에서 살다가 죽은 두사충은 만촌동(대구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묻힌다. 그곳은 그가 살아 있을 때 잡아놓은 자리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한다. 두사충의 후손들은 현재 전국에 약 100여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직계후손이 두사충 묘 입구에 있는 사당 ‘모명재(慕明齋)’를 지키며 살고 있다. 모명재 역시 고국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사충의 묘는 당시 중국 풍수들의 터 잡기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서 현재 술사들이 선호하는 혈장(穴場·유골이 안치되는 일정한 곳으로서 혈을 이루며 특정한 형태를 갖춘다)을 찾기는 어렵다. 그 대신 주변 산들이 편안하면서도 위엄 있게 이곳을 감싸고 있다.
특이한 점은 두사충 무덤 주변에 국가정보원 지부와 2군사령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후손 두재규씨는 “살아 있을 때도 군대 속에서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군사들을 보초 세울 정도로 땅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풍수에서는 “사람은 자기 세계관에 맞는 땅을 찾아 들어간다”고 말한다. 두사충의 세계관과 당시의 풍수 양식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절들은 대부분 공식 명칭에 ‘사(寺)’를 쓴다. 예컨대 ‘해인사(海印寺)’라고 하지 ‘해인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절 모르고 시주하기’ ‘절에 가면 중노릇 하고 싶다’ ‘절에 가서 젓국 달라 한다’ 등 ‘절’과 관련된 속담도 많다. 그만큼 ‘사’라는 말보다는 ‘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친숙했음을 뜻한다. 전국적으로 공식 명칭에 ‘절’을 쓰는 곳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잘 알려진 곳을 꼽자면 ‘떡절’(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굿절’(경기 여주읍 가업리) ‘꽃절’(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정도다. 순수 우리말로 붙여진 이런 절 이름은 풍수와도 특별한 관련이 있어 흥미롭다.
풍수의 개념 가운데 하나는 ‘땅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은 용도를 결정하는 행위’다. 땅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땅의 생김새, 산의 높이, 물의 위치,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땅의 성격을 파악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특히 순 우리말로 된 땅이름은 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땅의 기운이 더러 그 땅이름으로 나타나기(現象)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굿절’은 굿을 하기 좋은 절이고, ‘떡절’은 절 자체가 하나의 떡을 의미하며, ‘꽃절’은 절과 주변 형세가 꽃과 같아 그 이미지(象)를 취한 것이다.
‘굿절’은 과거 무당들이 굿을 많이 하던 곳이다. 지금은 조계종으로 귀속되어 ‘구곡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지만,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굿절’이라고 부른다. 또한 절의 기능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곳 김명철 주지 스님은 “인근의 여주 신륵사가 대중 교화지자 관광지로서 사람이 들끓는 반면, 이곳은 기도처자 천도재를 올리는 곳이라 사람이 없는 편”이라고 밝혔다. 기존 ‘굿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꽃절’은 절을 둘러싼 주변 형세가 마치 꽃과 같다. 절은 그 꽃의 씨방에 해당하는 곳에 있다. 이른바 풍수 물형론에서 말하는 ‘화심형(花心形)’이다. 그에 걸맞게 이곳은 현재 미모의 비구니가 혼자서 지키고 있다. 산세와 절 이름, 그리고 그곳 주인이 모두 하나로 어울리는 듯하다.
‘떡절’은 청도군 화양읍 강 건너 주구산(走狗山) 끝자락에 있다. 주구산은 마치 굶주린 개가 달리는 듯한 형상이다. 굶주린 개의 형상이 이곳 주민에게 편안함을 줄 리 없다. 그래서 16세기 중엽 이곳에 부임한 군수 황응규가 이 산 이름을 개가 달리는 모양의 산이라 하여 주구산이라 이름짓고, 이 굶주린 개를 달래는 방법은 떡을 먹이는 것이라 하여 달리는 개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절을 지어 ‘떡절’이라 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일종의 진압풍수다. 그 후 청도에서 큰 부자가 줄지어 나왔고, 이를 감사히 여겨 훗날 사람들은 황군수를 위한 사당을 지어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렇게 땅의 성격을 대변하는 우리말로 된 절들을 요즈음 한자를 병기하거나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예컨대 떡절은 병사(餠寺), 꽃절은 화암사(花岩寺), 굿절은 구곡사(舊穀寺)로 쓴다. 우리말로 된 좋은 절 이름이 오히려 절의 흥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름을 바꾸려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풍수학자인 최창조 교수(녹색대 대학원장)가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은 최교수 자신과 SK 그룹의 관계에 대해서였는데 우리 사회의 풍수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해 소개하기로 한다.
최교수가 전화상으로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렇다. 최근 SK 사주가 구속되고 SK 그룹 전체의 운명이 불확실해지면서 ‘SK 그룹의 몰락이 조상의 묏자리 탓’이라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괴소문은 몇 년 전 타계한 최종현 SK 회장의 묏자리가 문제이고, 그 터를 잡아준 지관이 최교수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게다가 이 말이 흰소리하기 좋아하는 일부 ‘풍수쟁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돌아 한 기자가 최교수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까지 걸어왔다.
뜻밖의 전화를 받은 최교수는 어이가 없었다. 우선 최교수가 고 최회장의 장지 선택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 둘째는 고 최회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을 장려했고, 스스로 화장을 택했기 때문에 풍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SK 선영 확인 결과 대체로 무난
그런데 왜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 고 최회장이 생전에 최교수와 가까웠던 건 사실이다. 최교수가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재야로 밀려나자 고 최회장이 최교수의 학문적 능력을 아까워하며 연구활동을 지원한 것이 시작이었다.
고 최회장의 후원으로 최교수는 조선조 풍수학 4대 고시과목 가운데 ‘청오경’ ‘금낭경’을 역주하여 발간했고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등 다양한 풍수담론을 만들어내며 ‘자생풍수’의 기반을 닦았다. 고 최회장은 풍수학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까지도 지원하려 했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고 최회장은 죽기 전 자신을 화장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유언에 따라 서울 시내 납골묘지에 안치될 예정이었던 그의 유골은 화장장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경기 화성에 있는 선영에 모셔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땅을 아주 깊이 파고 매장했는데 그 까닭은 몇 년 전 롯데 신격호 회장 선영 도굴 사건에서 보듯 도둑들이 돈 많은 이들의 유골을 도둑질해 그 후손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교수의 얘기를 듣는 동안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우선 약 1400년 전 수나라 황제와 풍수학자인 소길(蕭吉)의 일화다. 당시 수 문제의 부인 헌황후(獻皇后)가 죽자 황제는 소길에게 장지를 잡게 했다.
소길은 무산(筮山)의 한 곳에 자리를 잡아 황제에게 “이 자리는 2000년이나 명당발복해 200세 후손까지 지켜줄 자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
“길흉화복이란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땅의 좋고 나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 조상 무덤 자리가 나빴다면 나는 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좋았다면 왜 내 동생이 전장에서 죽었겠는가?”
같이 전쟁에 참가해 동생은 죽고, 자신은 황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풍수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생각은 풍수와 화장의 관계. 묘지풍수의 핵심이론이 ‘동기감응설(同氣感應說)’이다. 이는 같은 기끼리 서로 감응하여 상승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묘지풍수의 경우 조상의 기와 나의 기가 감응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무덤 속에 묻힌 조상의 유골이 부식하면서 발산하는 기와 살아 있는 후손의 기가 감응하는데 좋은 기끼리 만나면 길하고 나쁜 기끼리 만나면 흉하다는 것.
이때 매개가 되는 것은 조상의 유골이다. 지관들은 자주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그런데 매장하지 않고 화장할 경우 유해가 사라지고 한 줌의 재만 남기 때문에 매개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음택풍수 논리를 설혹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화장을 한 경우 후손이 명당발복의 득을 얻을 리도 없겠지만 불행한 일을 당할 리도 없는 게 당연하다.
최교수와의 통화를 끝낸 후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모 스포츠신문에 고 최회장 선산에 대한 선동적인 글이 있었다. 내용인즉 선영 앞으로 고압선이 흐르고, 우백호 자락이 훼손되고, 그 앞으로 고속전철이 지나가니 앞으로 안 좋을 것이며 따라서 이장을 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글이었다. 심지어 고 최회장 형제가 장수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선영 탓이란다.
이 정도 내용이면 이미 풍수의 금도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최종현 집안이 국내 재벌로 성장한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일부 지관과 언론은 SK가 한창 잘나갈 때에는 이 선영이 명당 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다.
필자가 고 최회장의 묏자리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묘역을 찾았을 때 묘 입구는 철조망과 자물쇠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다. ‘허락 없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다.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철망을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들어오지 말라’는 땅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풍수의 기본 윤리다.
그래서 편법을 쓰기로 했다. 선영 반대쪽에서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으로 가장해 해당 선영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고 최회장의 선영은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었지만 일반 분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윗대부터 차례로 내려 쓴 묘역 하단에 있는 고 최회장의 무덤에는 아예 비석이나 상석조차 없었다. 뒤 주산에 해당하는 것은 한 일(一)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능선이 내려와 묘역을 이루었다. 또한 좌우에 산들이 비교적 잘 감싸고 있어 외부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다. 죽은 자의 휴식처로서 그만한 땅도 드물었다. 물론 완벽한 천하의 명당은 없다(風水無全美). 어느 땅이나 아쉬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아쉬움은 조경으로 충분히 보완된다. 이것을 일러 비보진압(裨補鎭壓) 풍수라 했고, 최교수는 여기서 바로 ‘자생풍수’라는 담론을 이끌어냈다.
SK 선영보다 안 좋은 곳에 묘역을 조성한 이들이 더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집안의 대가 끊기거나 망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창 밖으로 눈을 돌려보라. 시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무덤들이 이보다도 좋지 않은 묘역들이다.
수소문 끝에 알게 돼 길라잡이를 해주신 최낙기씨(46·선문대 사회교육원 풍수강사)도 이곳을 편안한 땅이라고 감평했다.
“고압선이나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우백호 자락의 훼손이 심하다는 곳도 이곳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풍수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특히 화장 후 한 줌의 재만이 안치된 고 최회장의 무덤과 그 후손의 길흉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풍수 밖의 일이다.”
답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공연히 멋쩍어지고 말았다. 쓸데없는 소문에 휘둘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소문을 만들어낸 이들의 천박함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땅과 인간이 서로 닮아간다’는 지인상관론(地人相關論)은 풍수가 전제로 하는 명제다. 단순히 서로 닮아가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갈등을 두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제주도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산방산(山房山) 앞에 기괴한 산이 하나 있다.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인성리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단산(簞山)’ ‘박쥐오름’ ‘바금쥐오름’ ‘파군산’ 등으로 불린다. 제주도 특유의 기생 화산인 ‘오름’은 제주도에서는 산으로 통하기 때문에 박쥐오름이나 바금쥐오름은 박쥐와 닮은 형상의 산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이곳에 처음 와보는 사람도 이 산을 보면 자연스럽게 박쥐를 연상한다.
그런데 이 박쥐 모양의 산과 이 산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산은 박쥐가 날개를 활짝 펴서 먹이를 덮치고 있는 형세로 마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없다고 믿었다.
민간에서만 이 산을 흉산(凶山)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300년 전인 1702년(숙종 28년) 당시 제주 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제작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는 이 산 이름을 ‘파군산악(破軍山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파군’이란 이름이 붙은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옛날 이곳에서 적군을 패퇴해 ‘파군(破軍)’이라고 했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풍수에서 산의 형상을 아홉 가지(‘九星’이라 한다)로 나누는데 이 산의 모양이 그 가운데 ‘파군(破軍)’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의 산을 ‘파군’이라 부르며 아주 흉한 산으로 본다. ‘파군의 산이 있으면 형벌과 겁탈, 나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당시 제주 목사가 이 박쥐오름을 ‘파군’으로 표기한 것이 흥미롭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00년(광무 4년) 이문사(李文仕)라는 사람이 “풍수적으로 마을 남쪽(박쥐오름 쪽)이 허하여 마을에 액운이 있으니, 탑을 쌓아서 액을 막으라”고 해 마을 사람들은 산과 마을 중간에 4개의 ‘거욱대’를 설치하였다. ‘거욱대’란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으로 ‘방사탑(防邪塔)’이라고도 하는데, 둥근 돌탑을 쌓은 뒤 그 위에 사람 얼굴 형상을 한 석상을 올려놓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1951년 이곳에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서면서 ‘거욱대’ 3기를 헐어 막사 신축용 자재로 써버렸다. 그 후 이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하는 등 불행이 잇따르자 1961년 거욱대를 원상복구하면서 인성리 마을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사계리에도 방사탑을 쌓아 이 산의 흉한 기운을 막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김정희의 추사체와 이 박쥐산의 관련설이다. 추사 김정희가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대정읍 안성리 적거(謫居)지 마당에서는 이 박쥐오름이 빤히 바라다 보인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는 단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험악하고 괴이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이곳 사람들은 “추사의 기괴한 글씨체가 바로 이 박쥐오름의 모양새를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말한다. 추사의 글씨체와 이 박쥐오름(파군산)을 비교해보면 ‘땅과 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경남 창녕읍 술정동에는 지은 지 500년이 됐지만 옛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초옥(草屋)이 있다. 현재 하병수 옹(河丙洙·84)이 거주하고 있는 이 초가집은 하옹의 16대 조상 하자연(河自淵)이 지은 집이다.
하자연이 이곳에 터를 잡은 내력이 흥미롭다. 무오사화(1498)에 연루돼 귀양을 간 그의 윗대 조상이 귀양지인 경상도 영천에서 병사하자 하자연은 초상을 치른 뒤 1506년 가족을 이끌고 고향인 진주로 낙향했다. 당시에는 영천에서 진주로 가려면 청도와 창녕을 거쳐야 했는데 하자연과 그 가족이 창녕에 도착했을 무렵 날이 저물어 대충 자리를 잡고 야숙(野宿)을 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숙지 뒤에는 반달 모양의 구릉(丘陵)이 둘러처져 있고 그 위에는 큰 당산나무가 서 있었으며 앞에는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어 터가 아주 좋아 보였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족인 하(河)씨들이 살고 있었다. 하자연은 즉시 이 땅을 사 집을 지었는데, 이때가 1507년이다.
그로부터 몇 십년 후 한강(寒岡) 정구(鄭逑)가 이 집에 들렀다가 뒤에 있는 정자를 보고 술정기(述亭記)를 지었는데, 그 후 이곳 지명이 ‘술정리’가 됐다.
이 집은 다른 집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집을 지을 때 못을 전혀 쓰지 않았다. 둘째, 일반 집들은 지붕과 서까래 사이에 나뭇개비 혹은 수수깡을 엮어 올리고 그 위에 ‘알매’라고 하는 흙을 바르는데 이 집은 흙을 바르지 않았다. 셋째, 마루 윗부분만 대패로 반듯하게 하고 아래는 통나무를 그대로 살렸다. 넷째, 초가지붕은 볏짚이 아니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우포늪에서 가져온 억새로 이었다. 지금도 그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와 10년에 한 번씩 우포늪에서 가져온 억새로 지붕을 새로 하고 있다.
하자연이 터를 잡은 뒤 자손이 한창 번성하던 중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났다. 하자연 후손들이 화왕산에 있는 큰 굴에서 9년간 피난생활을 하다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주변에 있던 집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하였는데 유독 이 집만은 그대로 있었다.
그 후 부분적으로 기둥이나 지붕을 갈기는 했지만 하자연이 지은 집은 지금까지 500년 동안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자연의 후손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집이 온전하게 보전되는 것이 집터가 명당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대개 한반도의 집들이 나무나 풀로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집이 몇 백년 동안 화재를 피해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곳 터는 화기(火氣)를 제압할 만한 적절한 수기(水氣)가 있다고 한다. 하병수 옹은 “이 집이 화왕산의 끝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수기가 강해서 화재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곳 터는 풍수상 ‘조리혈’이라고 한다. 조리는 쌀을 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이러한 형태의 터에 자리를 잡으면 많은 재물이 모여 집안이 번성한다고 한다.
명당에 터를 잡은 덕에 발복하는 것일까? 초옥이 500년 동안이나 그대로 보존되어오는 것만도 신기할 노릇인데, 현재 하자연의 후손 약 400세대가 서울 창녕 대구 등지에서 잘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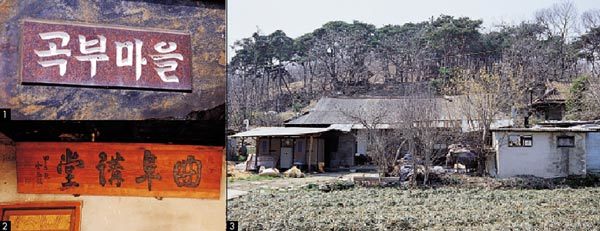
매화는 만물이 아직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피어 봄을 알리는 꽃으로 특히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 퇴계 이황 선생 역시 매화를 지극히 사랑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변소에 가지 못하고 요강을 사용할 때 방 안에 있는 매화에게 미안하다 하여 매화를 옮기게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만큼 그는 매화를 아꼈다.
이 고결한 매화가 지면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데, 매화가 지는 명당에 터를 잡으면, 온 세상을 교화할 수 있는 성현이 나온다고 풍수가들은 이야기한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둔 어느 준수한 청년이 매화낙지(梅花落地) 명당으로 알려진 부여군 은산면 곡부(曲阜·고부실)마을을 찾았다. 공자의 고향마을과 같은 이름을 가진 곡부마을에는 시대의 흐름에 초연하겠다는 듯 ‘곡부서당’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젊은이들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 법대생도 명예와 부를 가져다줄 법조인의 길을 버리고 이곳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판·검사가 될 수재가 어찌…” 하는 주위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그는 매화 향기에 취했던 것일까?
이곳 곡부마을 주변 형세는 매화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마을 뒷산인 매봉(梅峰)을 중심으로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이루는 산세는 매화처럼 부드럽고 화사하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맑은 물과 마을 입구에 드넓게 펼쳐진 논밭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좋은 터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 마을에 사는 신원균옹(78)은 이 마을이 “풍수지리적으로 충남에서 가장 좋은 터이며, 예부터 삼성팔현(三聖八賢·3명의 성인과 8명의 현인)이 배출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곡부서당의 훈장인 김희진 선생은 이곳 출신이 아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일부러 매화낙지인 이곳에 찾아들어 서당을 열었다고 한다. 법조인의 길을 가기를 포기한 법대생은 이곳 서당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5시30분: 기상, 청소
6시30분:‘성학집요’(聖學輯要·율곡의 저서) 공부
8∼9시: 아침식사
9시 이후: 소리 내어 읽기(日課 聲讀)
12∼13시: 점심식사
13시30분 이후: 공부
17시 이후: 율곡 이이와 간재 전우(田愚·조선시대 말의 학자)에 대한 토론
18∼19시: 저녁식사
19∼22시: 공부
22시: 취침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훈장은 작고했고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서당이던 집에는 지금도 ‘曲阜講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지만 서당과는 무관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나 봄바람에 매화가 흩어지듯 뿔뿔이 흩어진 곡부서당의 제자들은 큰 학자가 되어 세상을 교화하고 있다. 법관의 길을 버렸던 법대생은 국립대 동양철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며, 15년 넘게 매주 월요일 저녁 40여명의 교수들에게 사서삼경을 강의해오고 있다. 그의 강의를 듣는 교수들은 40대 교수에서 정년 퇴임한 70대의 노교수, 전·현직 대학총장 등 참으로 다양하다.
이밖에도 곡부서당이 배출한 대표적인 유학자로 성백효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교수, 김신호 성균관 한림원장 등 자타가 공인하는 한학의 대가들이 여럿 있다. ‘훌륭한 군자가 나온다’는 이 마을의 전설이 현실이 돼가는 것 아닐까.

가수 송대관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노래는 ‘쨍 하고 해 뜰 날’이다. 가수로서 이름을 날리기 전 어두웠던 시절 그에게 ‘쨍!’ 하고 햇빛을 비춰준 이 노래는 1970년대 당시 가난한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70년대 중반 필자가 전주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영생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는 야간반이 있어서 시골 출신들이나 고학생들이 많이 다녔다. 야간수업을 끝내고 귀가하는 그들은 매일 밤 ‘쨍 하고 해 뜰 날’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어째 조용하다 싶은 날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쨍 하고 해 뜰 날’을 유독 좋아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송대관이 바로 영생고 선배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밤의 ‘교가(校歌)’는 ‘쨍 하고 해 뜰 날’이었고, 송대관은 그들의 우상이었다.
노래의 가사 내용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꿈(목표)→노력→성공’이라는 ‘삶의 모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송대관이 자신의 삶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흔히 인걸지령론(人傑地靈論)을 이야기한다. 땅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혹은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예컨대 ‘장군형’에서는 무인적 기질의 사람이, ‘옥녀(玉女)형’에서는 팔방미인이, ‘선인(仙人)형’에서는 속세를 벗어난 자유분방한 예술인이 나온다고 한다.
송대관이 ‘트로트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다양한 풍수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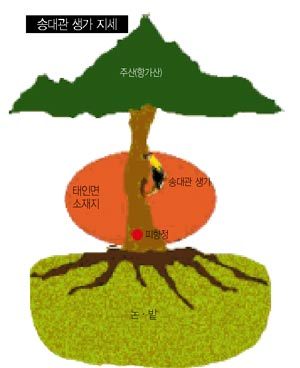
송대관의 생가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소재지에 있다. 호남 제일의 정자로 알려진 피향정이 있는 이곳 태인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이다. 일제 때 태인 대신 ‘신태인’이란 이름으로 철도역이 개설된 것도 바로 그 보수성 때문이라고 한다. 답사 중에 만난 김종순씨(58)는 “(태인 사람들이) 입도 짜고, (태인의) 물도 짜고, 사람도 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도 짜다’는 말이 그 보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이 짜다’는 것은 태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모두 공감한다. 답사 중에 만난 김송자씨(58) 역시 “이곳 물은 맛이 짤 뿐만 아니라 빨래를 하면 때가 지지 않아. 그래서 시집 와서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라고 말했다.
물맛에 따라 인심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이미 2500여년 전 중국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관중(管仲:?~B.C. 645)이 이야기한 것으로, 그는 “물은 만물의 본원이자 모든 생명체의 종실이며, 아름답고 추함, 어질고 어리석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물은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이며,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속에 기억된 정보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주장 역시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태인의 또 다른 특성은 그곳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다. 송대관의 외삼촌인 국희엽씨(68)는 “이곳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송대관 외갓집 식구들이 모두 음정이 정확하다”며 “대관이가 어려서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이한 것은 송대관의 생가 터다. 주산(主山)인 항가산의 큰 산줄기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곳 중간 지점에 생가가 있고, 산줄기는 다시 내려가 넓은 들판으로 잦아든다. 지세가 마치 큰 나무와 같다. 내룡(來龍·주산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은 태인의 넓은 들판에 뿌리를 내린 나무의 굵은 줄기에, 우산처럼 펼쳐진 항가산은 나무의 잎부분에 해당한다. 송대관의 생가 터는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는 새와 같다.
풍수에서는 이를 ‘노란 꾀꼬리가 나무를 쪼는 형국(黃鶯啄木形)’이라고 말한다. 꾀꼬리는 노랫소리가 아름답다. 그러나 꾀꼬리는 나무에 잠시 살다가 떠난다. 그래서일까, 이런 집터는 사람을 오래 머물 수 없게 한다. 가수 송대관이 태어나 자랐던 그 집터는 그새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
‘쨍 하고 해 뜰 날’의 노래가사처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그를 있게 해준 배경에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의 인심과 환경, 물맛, 집터,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풍수의 기본개념 가운데 하나가 땅의 성격을 파악해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학교 터, 집터, 사찰 터가 각기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올 7월 계룡시로 승격한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음절마을, ‘도깨비 터’로 알려진 이곳에는 종교 관련 건물들이 유난히 많아 그러한 풍수의 기본개념에 충실한 땅이 아닐까 여기는 이들이 많다. ‘엄사(奄寺)’란 행정구역명 또한 바로 이 ‘음절’을 한자로 바꾼 것이다.
도깨비는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친숙한 귀신이다. 이를테면 도깨비가 힘이 세서 황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솥뚜껑을 솥 속에 넣어 밥을 못 짓게 골탕을 먹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필자도 듣고 자랐다.
음절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깨비 터로 알려지게 됐을까. 이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13년째 이장을 맡아온 이효택씨(43)에 따르면 원래 이곳은 13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마을이었다. 그 이전에는 이곳에 음절이란 큰 절이 있었다는데, 언제 생겨서 언제 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인근에 계룡대(삼군본부)가 들어서면서 이곳 음절마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씨는 “집 다섯 채 지으면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되더니 지금은 교회가 족히 100개는 된다”고 말했다. 교회뿐만 아니다. 마을에는 종단이 서로 다른 절들, 요가원, 점집,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흥종교 건물들이 혼재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외지인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집터를 팔라고 졸라대는데, 대개는 절이나 교회를 짓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 건물의 유형도 다양하다. 우람한 고층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시멘트로 지은 사찰, 슬레이트 지붕이 얹힌 건물이 이색적인 민족종교 사원, 일반 주택에 온갖 부적으로 도배해놓은 점집…. 일요일이면 더욱 볼 만하다. 찬송가, 목탁, 염불, 주문 소리들이 아우러져 그야말로 도깨비들 잔칫날 같다.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일까? 원래 도깨비 터였는데 이제야 그 땅이 제대로 쓰이는 것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옛날에 이 마을에 있었다는 ‘음절’이란 큰 절이 망한 것만 보아도 이곳 터가 절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까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계룡대가 들어서면서 그 인근에 있던 많은 종교 건물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도깨비 터로 알려진 이곳에 대체지로 선택한 듯하다.
그렇다면 왜 계룡산은 무당들이나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그것은 좌절된 영웅과 땅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개 굿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까닭은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보고자 해서다. 이때 좌절한 영웅(예컨대 최영 장군이나 관우 장군)들의 분노에 찬 영혼을 위로해주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그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좌절된 땅’이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조상들은 산에도 신격(神格)이 있다고 믿었다. 조선조까지만 해도 명산에 ‘대신(大神)’이라는 직위를 내리고 제사를 지냈다. 계룡산도 그러한 명산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해 1년 가까이 공사를 벌이다 돌연 취소했다. 한마디로 ‘소박’을 맞고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됐고, 때문에 계룡산에서 기도하면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언제부터인가 무당이나 종교단체가 모여든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음절이 도깨비 터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풍수적으로도 좋은 절터(다른 종교건물 포함)가 되려면 명당의 기본요건을 갖추는 이외에 터 주변에 암벽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이곳에 있었다는 ‘음절’이 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종교가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건 ‘도깨비의 장난’인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풍수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극과 극으로 갈린다. 그러나 동아시아 수천년 역사에서 숱한 사상들이 부침을 거듭하는 속에서도 풍수는 그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까지 ‘Fengshui(풍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외국어대 김현택 교수(러시아학과)가 “올 6월에 러시아에 갔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수많은 풍수 서적들을 보고 놀랐다”고 말할 정도로 이미 풍수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물론 서구 유럽에서 수용하는 풍수는 조경과 인테리어 분야에 관련된 실용풍수다.
이같이 풍수가 유행하는 현상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드물지 않아 2001년 제주대에서 ‘국제 풍수 학술대회’가 열렸는가 하면, 같은 해 ‘한국사상사학회’에서도 풍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풍수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진지하게 이루어져 올해 초 일본의 학술지 ‘아시아 유학(遊學)’에서는 풍수를 특집으로 다룰 정도였다.
동아시아의 그 어떤 대학에도 풍수학과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많은 풍수 술사와 풍수학자들이 배출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최초의 풍수학자는 고 배종호(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다. 그는 동양철학, 특히 유학을 전공했지만 풍수에도 능하여 1960년대에 풍수 관련 논문을 남겼다. 이어 ‘한국의 풍수사상’이라는 책을 발간하며 풍수학자임을 선언한 최창조 교수가 그 뒤를 잇는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에야 그가 거둔 풍수학적 성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올 3월 ‘교수신문’에서 ‘우리 이론을 재검토한다’라는 주제로 최교수의 ‘자생풍수’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그의 풍수이론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학계뿐만 아니라 풍수 술사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풍수 술사들이 이렇게 ‘잠재적 우군’에서 ‘적’으로 돌아선 까닭은 최교수가 그들의 밥벌이가 되는 ‘묘지 풍수’를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묘지 풍수를 부정하면 풍수 술사들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교수는 묘지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발복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묘지 풍수 술사들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여긴다.
그런 최교수가 올해 초 대안학교인 ‘녹색대학’(총장 장회익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학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거둔 제자 김현욱 교수(상지 영서대 겸임교수)를 데리고 경남 함양의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갔다. 서울대 교수직을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강단에 복귀한 것이다.
그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제도권 학교가 아닌 ‘도제식’ 교육이 가능한 곳에서 풍수학을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곳 대안학교 터의 성격이 맘에 들었던 것 같다. 다음은 이곳 녹색대학 터에 대한 최교수의 평이다.

“녹색대학이 들어선 경남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오매실 마을은 그 풍수적 조건이 대학의 건학 이념에 잘 맞는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이 일대는 백두대간이 남쪽 끝 무렵에 가까워져서 무주의 덕유산이라는 큰 지기(地氣)의 저장고를 만든 뒤 마지막이 될 지리산을 앞두고 국토 중 가장 강대하면서도 온유한 지기를 지리산으로 내뿜기 위하여 기를 압축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 호스를 꾹 눌러줘야 물줄기가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꾹 눌러주는 바로 그 부위에 녹색대학이 섰으니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리산 같은 장대한 기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풍수 전문용어로 말하면 녹색대학이 ‘과협처(過峽處)’에 터를 잡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많은 풍수 술사들은 과협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다. 최교수는 땅의 성격과 그곳에 들어설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부합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반 술사들은 기계적으로 땅을 보아 주산과 청룡백호의 유무 및 그 미추(美醜)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도 많고 설도 구구한 것이 풍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피어라! 녹색대학’이라는 녹색대학의 슬로건처럼 이곳에서 풍수학도 함께 피어나기를!
전북 임실군 삼계면 박사마을

누구나 한 번쯤은 전원생활을 꿈꿔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도시인들은 전원생활을 그저 꿈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도시 근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살면서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한다.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어 있는 시골 농가를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꾸미는 방법과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의 임야나 논밭을 사 지목변경을 한 뒤 전원주택을 짓는 방법이다. 후자를 택하는 이들은 대개 낯선 시골마을에 들어가 살기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새로 집을 짓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풍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새로 산 땅이 집터로 적합한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땅에 집을 짓게 될 경우 오래가지 않아 주인이 바뀌거나 폐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터가 좋은 터일까? 풍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원주택 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조선 성종 때 권신인 임사홍은 임금에게 올린 상소에서 “집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보려면 그 집에 살았던 주인들을 3대에 걸쳐서 살펴보십시오(先看三代主)”라고 하였다. 즉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별 탈 없이 살다 나갔느냐, 망해서 나갔느냐를 보면 된다는 것이다. 임사홍의 이 말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땅을 보는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급적 안전하게 시골의 빈집이나 빈터를 구해 집을 개조하거나 새로 지으라고 권하고 싶다. 낯선 마을에 들어가 살기가 부담스럽다면 마을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빈집이나 빈터를 구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빈집이나 빈터로 남았다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해 나갔다는 증거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농촌에 빈집이 생기게 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지 땅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빈집 가운데 아무 집이나 고르라는 말이 아니다. 우선 어느 고장 어느 마을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고장과 마을을 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역시 그 땅에서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북 임실군 삼계면은 ‘박사마을’로 유명하다. 2003년 9월 현재 이곳 삼계면에서 배출된 박사가 100명이 훨씬 넘는다. 임실군의 다른 면들에서 배출된 박사 수에 비교하면 평균 10배나 많은 수치다. 사회학자 한상진(서울대 교수), 중문학자 허세욱(전 고려대 교수) 등 석학들도 이곳 출신이다. 그렇다고 삼계면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살거나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심병양씨(삼계면 뇌천리)에 따르면 “머슴살이해서 자식들 박사 만든 집도 많다”고 한다. “논 2마지기만 있으면 자식들 가르쳐서 박사 만들었다”고도 한다.
삼계면의 모든 마을에서 골고루 박사를 배출한 것도 아니다. 마을별로 삼계면 ‘덕계리’라는 행정구역 안에 중촌과 쭛쭛 마을이 있는데, 중촌은 20가구에서 9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가구당 0.45명인 반면 이웃한 쭛쭛 마을에서는 35가구에서 2명의 박사만 나왔다. 또 삼계면 ‘뇌천리’라는 행정구역 안에 뇌천과 쭛쭛 마을이 있는데, 뇌천은 23가구에서 9명의 박사가 나와 가구당 0.39명인 반면, 이웃한 쭛쭛 마을은 21세대에서 박사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지세의 차이다. 박사를 많이 배출한 마을의 경우 풍수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다.
물론 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해서 이곳에 부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곳을 답사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박사가 많아도 가난하다. 이웃 면인 동계면(순창군)에는 돈 많은 사업가가 많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마도 지세 탓인가 보다.”
이런 점을 참고한다면 풍수를 몰라도 얼마든지 좋은 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가수’ ‘진정한 장인정신을 가진 예술가’ ‘한국인의 한과 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수’.
‘오빠 부대’의 전설을 만들어낸 가수 조용필에게는 이렇듯 다양한 수식어와 찬사가 따라붙는다.
조용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음악교육을 받고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니다. 순전히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명’이란 것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면 제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에는 노력과 재능 이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라는 글에서 풍토를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다. 소위 인걸지령론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생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답사지가 되곤 한다. 풍수학자 박시익 교수(영남대 환경대학원)는 금년 초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생가들을 답사한 뒤 필자에게 답사 소감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생가들은 전체적으로 평지에 있으나, 평지에서도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용(龍) 위에 터를 잡았음이 분명하다.”
용은 풍수 용어로 산 능선을 말한다. 높은 산 능선뿐만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과 같은 작은 능선들도 용이라 부르는데, 이 용을 따라 지기(地氣)가 흐른다고 한다. 평야지대에서는 용을 중시하는 반면, 산간지대에서는 용뿐만 아니라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주변의 산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변의 산들을 흔히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라고 한다.
조용필의 생가는 경기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에 있다. 생가는 없어지고 주인이 바뀌어 새 집이 들어서 있다. 오랫동안 이 마을 이장을 맡았던 이만희씨(62)가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조용필의 윗대는 대단한 부자였다고 한다. 정미소까지 갖고 있는 큰 부자였는데 부모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조용필이 가수로 유명해지자 많은 지관들이 생가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왔다. 지관들은 조용필 부모 대에서 가세가 기운 까닭이 이곳 집터가 소의 ‘길마’ 형상인데, 한쪽으로 짐이 너무 많이 실려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했단다. ‘길마’란 짐을 싣기 위해 소 등에 얹는 안장과 같은 도구를 말한다. 짐을 조금 실었을 때에는 좌우 균형이 잡히지 않아도 괜찮지만 짐이 많아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듯 이런 ‘길마’ 형상의 터의 경우 재산이 적을 때에는 상관없지만 점차 재산이 많아지면 급격히 가세가 기운다고 한다.
지형지세로 보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집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어떤 이는 이곳 생가터를 쌍정마을 전체 속에서 살펴보면 ‘바람에 휘날리는 비단 띠(풍취라대형·風吹羅帶形)’ 모습이라고도 한다. 대개 마을을 감싸는 좌우 산능선(청룡/백호)은 마치 두 팔로 아이를 안는 듯한 모습이지만 ‘풍취라대형’에서는 두 팔(비단자락)이 흔들거리는 모습이다. 조용필 생가는 바로 두 팔 가운데 오른쪽 팔 중간의 꺾어지는 부분에 있다. 허리에 두른 비단 띠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은 출세를 상징한다. 그러나 바람에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도 동시에 암시한다. 조용필 생가의 경우 주변이 과수원으로 개간되면서 더욱더 바람에 쉽게 노출되었다. 그만큼 흩어짐을 재촉했을 것이다. 이런 터에선 재산도 사람도 흩어지게 마련이다.
1990년대 중반 이인제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곳 조용필 생가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땅값이 너무 비싸 포기하고 말았다. 이곳 생가터는 사람이 거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터로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작고한 조용필의 부모 묘와 부인 묘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생가터를 복원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작고한 최명희 선생(1947~98)의 무덤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전주의 어느 나지막한 야산에 있다. 무덤 앞에 서면 최선생의 모교인 전북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바로 그 옆에는 그의 대작인 대하소설 ‘혼불’에 등장하는 덕진연못이 있다.
최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자리한 데에는 풍수와 관련된 사연이 있다. 몇 년 전 최선생의 동생 대범씨(46)가 필자를 찾아왔다.
“누님이 위독하여 장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고맙게도 묘지로 쓸 땅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전주시가 후보지를 제시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당시 필자는 ‘혼불’에 푹 빠져 있던 참이었다. 특히 작가가 풍수에 대해 묘사한 대목은 그 어떤 풍수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역시 혈이 있을 것인즉, 그 혈을 찾고 다루는 일이 정신에 그리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제 인생의 맥 속에서 참다운 혈을 못 찾은 사람은 헛되이 한평생 헤맬 것이요, 엉뚱한 곳에 집착한 사람은 헛살았다 할 것이다… 만일에 정신이나 인생에 그 혈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설혹 안다 해도 못 찾고, 또 찾았대도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하여 비워둔 채 쓸모없이 버려둔다면, 이는 제 정신이나 제 인생을 눈먼 문둥이로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혼불 3권)
풍수의 최종목적은 혈을 찾는 것이다. 혈이란 무덤의 경우 시신이 안장되는 곳이며, 도읍지의 경우 왕이 머무는 궁궐이 들어서는 자리를 말한다.
작가 최명희는 땅의 혈을 찾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고향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행위를 혈을 찾는 것에 비유했다. 이제껏 이보다 더 깊이 풍수를 이해하는 이는 없었다. 풍수에서 땅을 보는 안목이 일정한 경지에 오른 것을 ‘개안(開眼)했다’고 한다. 개안하면 땅으로 인해 인간에게 미칠 길흉화복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다. 바로 작가 최명희는 일찍이 개안한 것이다.

필자는 평소 작가 최명희가 어떻게 그렇게 풍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차에 최선생의 동생이 찾아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분과 전주시에서 추천한 장지와 그 외 여러 곳을 살펴보게 되었다. 이른바 묘지를 소점(터를 잡는 일)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소점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우선 사람과 땅이 부합하는 곳이어야 한다. 땅의 성격뿐만 아니라 고인의 인생관이나 고인이 평소 선호한 지형지세를 알아야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 최선생의 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둘이 함께 땅을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둘이서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술도 많이 마시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가의 취향이며 가정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최선생 형제는 2남4녀다. 여자 형제들은 문학에 재능을 보여 세 자매가 모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막내 여동생도 국문학과에 입학하려 했으나 세 언니들이 작가가 배고픈 직업이라며 극력 반대하여 전공하지 못했다. 최선생이 풍수에 조예가 깊어지게 된 것은 외조부 허완(許晥)을 통해서였다. 선생의 외조부는 예학뿐만 아니라 주역과 풍수에도 능하여 작가가 ‘혼불’을 집필할 때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고 한다.
최선생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선생이 좋아할 만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찾아 선생의 묘소로 정하게 되었다. 그가 다녔던 전북대가 내려다보이고 가까이에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덕진연못이 있는 곳, ‘혼불’의 풍수 관련 대목에서 묘사하는 것과 의미가 상통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이다.
현재 최선생의 묘소는 그렇게 해서 정해졌다. 작가가 결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손의 발복을 고려하지 않는 대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찾아와 작가를 기릴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선문대 풍수학 강사인 최낙기씨는 “최선생의 무덤 터는 멀리서 보면 마치 초롱불 같다”고 했다. 무덤은 거기에 안장된 사람을 그대로 반영한다. ‘혼불’이 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남해대교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경남 남해군에 ‘독일마을’이 생겨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문을 듣고 온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는 독일마을은 문자 그대로 독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전형적인 독일식 집과 파란 눈의 독일 노인의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따금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린다. 어떻게 독일인들이 이역만리 이곳 남해에 마을을 형성해 살게 됐을까?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는 변변한 자원도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돈을 빌리려 했지만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 등의 비협조로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서독이 1억5000만 마르크를 빌려주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준 것은 아니다. 당시 서독 역시 경제개발로 인력이 달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했다. 특히 간호사와 광부가 많이 필요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들을 서독에 보내주고 그들의 급여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이 돈은 장차 한국 경제 부흥의 종자돈이 됐다.
1차 서독 파견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 데 4만6000명이 몰릴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규 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이렇게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은 독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온 매혹적인 도우미’ ‘복숭아 눈을 가진 간호사’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독일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훗날 귀국했지만 독일인과 결혼해 남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흘렀다. 독일인 손자 손녀를 둔 60, 70대 노인의 이들은 연금으로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여생을 고향인 한국에서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럴 즈음 당시 김두관 남해군수(전 행정자치부 장관)가 이런 사연을 듣고 이들을 위한 삶 터와 부대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 독일인 배우자들도 함께 한국에 가 살겠다고 적극 나서 약 50가구가 한국행을 희망했다.
이렇게 해서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 뒷산 자락에 독일마을이 만들어졌다. ‘자기 취향대로 집을 짓되 독일식으로 짓기’로 하고 집과 정원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면 건물 외양 때문에 전형적인 독일마을처럼 보인다. 독일마을 터는 바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남해의 영산(靈山)인 금산의 한 줄기가 길게 뻗어 가다가 멈춘 곳이다.
풍수적으로 이곳 터를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다. 풍수가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이곳은 농부나 어부에게는 맞지 않는다. 농부들에게는 이곳이 너무 가파르고, 어부들에게는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년을 한가롭게 보낼 이들에게는 아주 쾌적한 공간이다. 뒤로는 산이 좌우로 팔을 펼쳐 감싸주고, 앞으로는 남해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이들이 터전을 마련할 때 ‘이곳에 사는 거미, 지렁이들과도 친하게 지내자!’고 할 정도로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했던 만큼 이들과 주변 산들도 잘 어울린다.
현재 이곳에는 올해 1차로 입국한 6가구가 살고 있다. 앞으로 남해군은 독일산 치즈, 햄, 포도주, 빵 등을 파는 독일 상점을 열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입국한 이들 가운데는 1970년대 간호사 김우자씨와 결혼한 루트비히씨(76)가 있다. 독일에서 42년 동안 세무서에 근무한 그는 고향 마인츠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밭과 포도주 창고가 있을 정도로 포도주에 조예가 깊다. 남해의 언론매체에 ‘와인 시음회’를 통해 포도주를 포함한 독일문화를 소개하느라 바쁜 그는 처가가 있는 한국에서 “독일문화를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해는 독일마을을 통해 독일문화의 참모습을 알리는 명당 한 곳을 갖게 됐다.

요즘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국토 잠식이 심각해지면서 화장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는 듯하다. 여기엔 매장은 보수적이며 환경 파괴적인 반면, 화장은 진보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분위기 탓에 풍수설이 매장을 부추긴다 하여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심지어 화장을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는 선진국에서는 매장이 아닌 화장이 보편적 현상이라며 화장을 설득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 화장이 오히려 환경 파괴적이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덕 건국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한 논문이 그것이다.
주검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기후나 지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빙하지역이 많거나 건조한 나라에서는 주검이 잘 썩을 수가 없다. 따라서 매장이 불가능하여 화장하거나 조장(鳥葬·새로 하여금 시신을 먹어 치우게 하는 것)할 수밖에 없다.
또 화장을 하려면 많은 양의 나무와 전기 등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화장할 때 나오는 매연도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화장한 뒤 남은 뼛가루를 처리하는 방법 역시 간단치 않다. 강이나 산에 뿌려도 오염의 원인이 되거니와, 매일 그렇게 많은 뼛가루가 산하에 뿌려진다는 것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납골당을 만들면 당장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재가 필요하다. 납골당에 필요한 석재를 캐기 위해서는 무덤 하나 깊이의 50배 되는 깊이의 땅을 파야 한다고 한다. 중국의 값싼 석재를 수입하면 석산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납골당도 ‘썩지 않고’ 오래 가는 건 마찬가지다.
반면 매장은 땅을 잠식하기는 하지만 한 집안의 중시조나 큰 인물의 무덤이 아니라면 몇십 년 후에는 봉분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초목이 자라 무덤이 있었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주검이 썩으면서 초목의 자양분이 되어 그야말로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런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매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석물로 치장하거나 호화분묘일 경우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히 제한하면 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묘지를 만들어 매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애는 ‘시한부 매장제’가 하나의 차선책이 될 수도 있다.
흔히 매장을 하려면 지관(풍수)을 불러 좋은 터를 잡고, 패철(나침반)이라는 도구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돌아가신 이를 땅에 모시는 데는 지관도 패철도 필요 없다. 묘지 좌우를 감싸주고 뒤에서 받쳐주는 산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곳이 없으면 주변에 기댈 만한 바위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근거로 자리잡으면 된다.
10여년 전 우연히 비탈진 자갈밭의 무덤을 찍어두었다. 밭 대부분이 자갈로 루어진 이곳을 평소 자주 지나다니다가 할머니 한 분이 가끔 밭을 매거나 가을걷이하는 것을 보곤 했다. 그런데 무덤이 생긴 뒤로 그 할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오랜 세월 직접 농사를 짓던 밭인 만큼 그곳이 가장 편안한 자리였을 것이다. 무덤 앞뒤에 있는 큰 바위를 주산과 안산 삼아 자리를 잡았다.
노대통령 부모 무덤 뒤에도 이와 같은 바위가 있다. 이를 흔히 괴혈(怪穴)이라고 한다.
그후 할머니가 묻힌 자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최근에 할머니 무덤을 다시 찍었다. 무덤에는 잔디가 자라 옷이 입혀졌고, 그 주변에는 몇 그루의 약용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거무튀튀한 자갈밭 대신 양지바른 곳에 무덤만이 보일 뿐이다. 이따금씩 무덤 앞에 소주병이 놓인 것을 보면 후손들이 자주 찾아오는 모양이다. 척박한 밭이 죽은 자를 위한, 아주 편안한 땅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곳이 진정 좋은 땅이다.

귀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무당 집터의 요건은 일반 사람들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북 순창군에는 옛날부터 소리꾼과 무당들이 많이 살았다. 신분 차별의식이 강했던 과거에는 그 같은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손이나 인근 사람들이 밝히기를 꺼려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무당이 살았던 집이 교회 또는 암자로 바뀌거나 절터가 무당의 집터로 바뀌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땅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도를 잘 알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살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 한 예를 교수인 고향 후배한테서 들었다. 전통문화학교 동양철학과 최영성 교수는 어렸을 때 순창읍에서 10리 떨어진 복실마을이란 곳으로 이사 간 적이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그곳은 조선 후기 8대 명창으로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았던 김세종의 집터였다고 한다.
그런데 저녁때나 새벽녘이 되면 어디선가 귀신소리가 들려와 최교수 어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했다. 마치 누군가가 소곤거리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교수 어머니는 우물로 물 길러 갈 때나 부엌에서 일할 때도 무서워서 언제나 어린 영성을 옆에 있게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족 가운데 세 사람이 연달아 까닭 없이 죽었다. 졸지에 집안 어른들이 잇따라 돌아가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고,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개·돼지 등 가축들도 죽어나가 “구덩이 파는 데 일년을 다 보냈다”고 최교수는 회고한다. 그래서 최교수 가족은 집을 팔고 그곳을 떠났다. 어린 시절을 보낸 옛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최교수가 훗날 그곳을 찾아가보니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있었다.
왜 당대 최고 소리꾼의 집터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훗날 교회 터로 변했을까? 소리꾼의 터와 교회 터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 판소리 연구가인 군산대 최동현 교수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과거 무당들이 살던 곳에는 소리꾼이 대개 한 가족을 이루어 살거나 동업관계였으며, 그 집터에서 귀신소리가 나는 것도 무당들이 그들과 자주 접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소리꾼의 집터는 무당의 집터이며, 무당이나 교회 모두 신이나 귀신과 관계하기 때문에 교회 터로도 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 자리는 풍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주변 산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정하게 등을 돌리거나 험하게 노려보는 형상이며, 집 옆으로 흐르는 시내 역시 감아 돌지 않고 집을 향해 치고 들어오는 형상이다. 이에 대해 장남식 풍수역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산이 집터에 등을 돌리고 있거나, 물길이 치고 들어오는 곳에서는 낮보다는 밤에 더욱더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크게 들린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산바람과 골바람이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뒤섞여 마치 귀신소리처럼 들리게 된다. 대개 새벽과 저녁 무렵에 귀신소리가 들리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까닭에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교차가 심한데, 환절기의 경우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 이상이 될 때도 있다. 이와 같은 형세의 집터는 바람막이가 전혀 안 되고 물길이 공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더 심하게 난다.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 사람들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심장에 충격을 준다. 기질적으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이럴 경우 갑자기 죽을 수가 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들리는 ‘귀신소리’가 공포 분위기를 증폭시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곳이 소리꾼이나 무당의 집터로는 명당인가?
소리를 하거나 귀신을 불러내는 것은 냉철한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은 술에 취한 듯한 분위기에서 가능하다. 결국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져야 하기 때문에 무당이나 소리꾼들은 그러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세종이 특히 ‘귀신 울음소리(귀곡성)’를 잘한 이유도 바로 이런 땅의 분위기 덕분일 것이다. 가끔 소리하는 사람들이 강변이나 폭포 아래에서 연습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치에서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어느 직업 술사가 자신이 ‘신행정수도 이전 자문위원’임을 내세워 모 일간지에 ‘풍수 컨설팅과 수강생 모집’이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낸 일이 있었다. 자신을 ‘국가의 지관(地官)’이라고 일컬으며 벌인 그의 영리행위를 놓고 일부 교수들이 뜨악해했다. 분명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해 학술적 연구와 강의를 하는 ‘풍수지리’ 전공 교수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검증되지도 않은 풍수 술사들을 행정수도 터 잡기에 동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었다.
‘지관’은 원래 조선조 잡과(雜科)의 고시과목으로, 경국대전에 명시된 지리학 시험에 통과한 관리를 말했다. 당시에는 풍수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도읍지를 정할 때 이를 반드시 이용했다. 또 조선 초기 정치가 하륜(河崙ㆍ1365~1416)은 “임금이 되는 일은 천명에 의할 수 있지만, 도읍을 정하는 일은 가볍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6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터 잡기의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점차 구체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초 도읍을 한양(혈처ㆍ경복궁/청와대)으로 정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 2년(1393년) 계룡산에 도읍지를 정한다. 기초공사가 몇 달 진행될 즈음 경기관찰사 하륜이 그곳을 방문하고는 ‘풍수지리로 볼 때 이 땅은 장차 망할 땅’이라는 상소를 올린다. 태조는 그 주장의 이치를 살피게 한 뒤 결국 계룡산을 도읍지로 정한 일을 취소시킨다.
이어 하륜은 도읍지를 무악(毋岳ㆍ현재 연세대/이화여대 일대)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지만, 다수 의견에 밀려 1394년 한양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한양으로 도읍지가 옮겨진 뒤 불행한 일들이 잇따랐다. ‘왕자의 난’으로 두 왕자와 개국 공신들이 살해되고, 태조가 사랑하는 후처 강씨가 죽었을 뿐 아니라 태조 자신은 아들(태종)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건강까지도 위독한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한양으로 온 지 5년 만인 1399년 개경으로 환도(還都)하는데, 이때 태조는 “내가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긴 뒤 아내와 아들을 잃었다”고 하여 한양 터 잡기의 실패를 시인한다.

개경으로 되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천재지변과 괴변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개경 환도 5년 뒤인 1404년 태종 이방원은 도읍지를 무악으로 옮기려 한다. 이때 태종은 부왕(父王)인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길 때 그에 찬성했던 지관들과 조정 대신들을 일일이 불러 심하게 꾸짖는데, 이 대목이 실록에 장황하게 묘사될 정도다.
그러나 무악으로 도읍지를 정하려 했던 태종의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국고가 비어 궁궐을 새로 조성할 여력이 없었고, 한양에는 이미 궁실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양의 혈처(穴處)라고 하는 경복궁에 머물고 있던 왕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자, 왕들은 경복궁에 머물기를 꺼려해 주로 다른 궁궐에서 머물렀다. 그나마 임진왜란으로 인해 불에 타버린 뒤 경복궁 일대는 270년 동안 잡초만 우거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두 곳을 풍수적으로 비교해보는 일도 흥미롭다. 한양(경복궁/청와대)의 경우 북악산과 인왕산이 모두 험석으로 강한 살기(殺氣)를 보이고, 북서쪽인 자하문 방향이 함몰되어 살풍(殺風)이 불어온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북악산에서 청와대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산능선이 애매하여 지기(地氣)를 받을 수 없고, 명당 수가 부족해 충만한 생기를 받을 수 없다.
반면 무악은 어떤가? 북악산→인왕산→‘안산(295m)’으로 산능선이 흘러가면서 험한 바위는 부드러운 흙으로 바뀌고, 지기(地氣) 역시 순한 기운으로 바뀌어 생기(生氣)를 많이 쌓는다. ‘안산’을 중심으로 좌우로 청룡백호가 낮으나마 힘있게 연대/이대 터를 감싸 안고 있으며, 동시에 ‘안산’의 중심 줄기 가운데 하나가 현재 연세대 교정 한가운데까지 내려오면서 지기를 뿜어준다.
신행정수도를 정하는 데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겠지만 무엇보다 풍수적으로 부합하는 땅이어야 좋다. “풍수설이 분분하고 지관마다 말이 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조선조 풍수학 고시과목과 같은 고증된 풍수 서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하여 풍수적으로 부합한지를 따지면 될 일이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를 몇 대에 걸쳐 보면 때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세가 점차 기울어 끝내 절손이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집안이 몇 대에 걸쳐 부흥한 결과 사회의 명문거족을 이루기도 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더러 집터나 조상 무덤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 명당 덕으로 명문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설화문학에 등장하는 모티프만은 아니다. 근세의 인물 가운데 이와 관련해 풍수 호사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호남의 인촌(仁村) 조상과 충청도의 윤보선 조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인촌 조상의 무덤들은 고창 부안 순창 장성 등의 좋은 땅에 자리하여 풍수 답사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명당 하나에 무덤 하나(一明堂一墓)’라는 풍수 원칙이 그대로 지켜진 전형(典型) 가운데 하나다.
윤보선 전 대통령 집안은 가문이 흥성한 이유가 조상을 명당에 모신 덕분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의 자서전에 그 내력이 자세히 나와 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5대 할아버지는 수원에 살았으나, 집터를 궁궐터로 빼앗기면서 가문이 처가가 있는 아산으로 이사를 했다(정조 임금의 수원 화성 축성 당시로 추정된다). 어느 흉년이 든 해 5대조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스님을 구해준 일이 있다. 건강을 회복한 스님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명당 자리 한 곳을 잡아주었다. 그러나 스님이 정해준 자리는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 후손에게 하사한 땅이었다. 스님은 조언하기를 5대조가 죽거든 일단 이순신 장군 산소 앞에 밀매장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발각되면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과하고 쓸 땅이 없어 그러니 사람들이 보지 못할 근처의 산속에라도 모시게 해줄 것을 간청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자리가 현재 윤보선 전 대통령의 선영이다.’
그곳에는 윤씨 가문에 명당발복의 ‘근원지(根源地)’가 된 5대조와 후손들의 무덤이 차례로 있다. 이곳을 답사하다 보면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배치의 문제인데, 5대조 할아버지 무덤 위쪽(또는 뒤쪽)에 윤 전 대통령의 무덤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의 무덤과 5대조 무덤 사이에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십자형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점.
흔히 조상 무덤 위쪽에 후손들의 무덤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무덤이 그 조상들의 무덤보다 위쪽에 쓰인 것을 보고 의아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풍수와 무관하게 집안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율곡도 그의 어머니 사임당 무덤 위쪽에 묻혀 있고, 실제 답사를 하다 보면 명문가의 많은 무덤이 그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잔디밭에 조성된 십자가형 나무다. 이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자신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이 선영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생전에 선영을 자주 찾았으며, 삼복 더위에도 밀짚모자 하나만 쓰고 온종일 잡풀을 뽑는 등 선영을 가꾸었다. 주변에 그늘을 만드는 잡목을 베어내고 잔디를 입히는 등 이곳을 명당으로 만드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집안 형제가 풍수설을 믿고 이곳에 무덤을 쓰면서 선영의 좋은 조경이 망가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누구든 이 잔디밭에는 무덤을 쓰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잔디밭과 십자가형 나무가 지금도 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의 선영에다 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그곳에 안장된 점, 또 5대조 무덤과 자신의 무덤 사이에 더 이상 무덤을 쓰지 못하게 한 점은 그가 이 땅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이다.

② 가운데 태봉산 부분이 무속적이라는 이유로 화가의 허락도 없이 덧칠해졌다.
③ 가운데 태봉산의 합장 그림.
광주 북구청에 가면 청사 벽면에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화가 홍성담씨의 작품으로 풍수와 사연이 깊다. 홍씨는 풍수지리가 우리의 전통 자연관임을 확신하는 이다. 흔히 우리의 전통 자연관이나 대지관이 도가나 유가, 또는 무속신앙에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풍수학(지리학) 고시과목들이었다.
풍수학 관리 선발시험의 고시과목으로 규정된 과목들을 공부해 시험에 통과한 이들을 조선시대에는 ‘지관(地官)’이라 불렀다. 이들은 도읍지와 왕릉 선정부터 사대부 무덤 자리잡기까지 터 잡기에 관여했다. 따라서 땅은 이들에 의해 ‘부자가 될 땅’ ‘자손이 많이 나올 땅’ 또는 ‘빈천해질 땅’ 등으로 평가됐으며,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땅을 바라보았다. 즉 자연을 보는 관점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풍수학 고시과목에서 언급하는 땅에 대한 평가방식에 따랐던 것이다.
홍씨는 이러한 풍수설을 우리의 전통 자연관이라고 해석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은 미물은 물론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다 살아(生)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풍수학은 시작한다. 그러므로 풍수학은 생명끼리 서로 화해를 구하고, 삶의 터전인 땅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것인가를 논한다. 이렇게 우리들 인간이 숨을 쉬듯 땅도 숨을 쉰다. 땅이 숨을 들이켜면 지맥을 만들고 내쉬면 물(水)이 흘러간다.”

그는 이런 자연관을 자신의 많은 작품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의 ‘명당도’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림에 그려진 집 뒤에 있는 산이 주산(主山)이고 좌우로 감싸고 있는 산들이 청룡과 백호다. 마당 좌우로 흐르는 물은 명당수이고, 그 명당수가 합해지는 곳에서 오리 두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데 이것이 합수다. 기와집이 있는 곳이 풍수에서 기가 온전하게 모인다는 혈(穴)자리다. 전형적인 명당도다.
광주 북구청 청사에 있는 벽화에도 그의 이런 풍수 관념이 뚜렷하게 반영돼 있다. 원래 광주 중심가(광주역 부근)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태봉’이라는 높이 50여m의 야산이 있었다. 그 생김새가 마치 큰 새의 알이나 구슬 같았는데, 조선 성종 임금의 태가 묻힌 곳으로 ‘태봉’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다.
이 태봉이 차지하는 풍수적 중요성은 매우 컸다. 광주 지역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노인들은 광주를 ‘이무기가 용(龍)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해석한다. 이때 태봉은 용의 여의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1967년 계림동에 있던 경양 방죽을 메울 때 태봉이 흙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없어졌다. 이무기가 승천할 수 있는 못과 여의주가 동시에 없어진 셈이다.
이것을 아쉬워한 홍성담은 1996년 ‘1980년 광주의 민중항쟁, 없어져버린 태봉과 경양 방죽, 그리고 과학문명 속에 인간 중심의 미래 광주’를 주제로 해 광주 북구청 청사 전면에 초대형 벽화를 그렸던 것이다.
벽화에서 경양 방죽과 태봉산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태봉 속에는 두 손을 위로 합장하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광주의 부활을 염원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광주의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것이 무속적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의 끈질긴 항의에 못 이긴 북구청은 화가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태봉 속의 사람 부분을 한지 선팅지로 덮어버렸다. 이 사건을 당시 광주의 예술인들과 문화부 기자들은 ‘예술품 암매장’ 사건으로 불렀다.

우리나라에 ‘절강(浙江) 시(施)’씨라는 보기 드문 성씨가 있다. 조선 광해군 때의 인물인 시문용(施文用·1572~?)을 시조로 하는데, 현재 경북 대구 그리고 서울 등지에 약 4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다. 절강은 중국 동남부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절강 시씨도 이곳에서 우리나라로 와 정착한 사람들이다. 언제 어떤 연유로 왔으며, 한반도 풍수와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시문용은 1572년 중국 절강에서 태어나 정유재란(1597년) 때 조선에 파병된 무장(武將)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군대는 철수했으나 전투하다 입은 어깨 부상으로 그는 경상도 성주에 남게 되는데, 이때 합천에 살던 정인홍(鄭仁弘)과 만난다. 정인홍은 광해군 때 영의정에 오른 대북파의 영수다. 정인홍과 시문용이 사귀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사연 때문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일어난 조선 중기 조선 왕실과 사대부들은 풍수지리, 특히 중국의 풍수이론을 선호해 중국인 풍수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또 정인홍의 조상 역시 절강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인연으로 정인홍은 시문용을 고향 사람이라 하여 각별히 대했다.
“풍수와 사주를 좋아했던 정인홍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시문용에게 길흉을 점치게 한 뒤 그에 따라 행동했다”고 동시대인 신흠(申欽)이 적을 정도였다. 정인홍은 당시의 임금 광해군에게 시문용을 소개했다. 이에 광해군은 1617년 경상감사에게 시문용을 한양으로 올려보내도록 했다.
한양에 온 시문용은 경덕궁(경희궁)과 인경궁이라는 새로운 궁궐 조성에 깊게 관여하며 광해군의 몰락 때까지 ‘왕실풍수’로 활동했다. 광해군은 인왕산 아래에다 잇달아 궁궐을 지어 국력을 낭비하고 무리한 인력동원으로 백성의 원성을 자아냈다. 당시에는 그 원흉으로 시문용이 지목되기도 했다.
백성과 대신들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광해군이 궁궐 조성을 시도했던 것은 전란으로 실추된 왕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광해군은 도성의 지기가 쇠했다고 믿어 처음에는 도읍지를 파주 교하(交河)로 옮기려 했다. 도읍지 이전으로 개혁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절되자, 그 대신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다.
광해군은 새 터에 새 궁궐을 지으려 했는데, 이는 기존 궁궐의 지기가 다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광해군은 풍수설을 믿었으며, 시문용이 광해군의 신임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시문용의 후원자였던 정인홍은 처형된다. 왕조실록은 시문용도 다른 풍수들과 함께 처형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문용 후손들은 그의 사망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광해군의 실각과 함께 시문용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아래맏질’이란 마을로 내려와 자연과 술을 벗삼아 여생을 누리다가 1643년 사망해 마을 뒷산에 안장됐다. 그 자리는 시문용 자신이 생전에 직접 잡은 자리라고 한다.
조정에서는 처형했다고 한 그가 어떻게 20여년 동안 더 살 수 있었을까?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정에서 다른 조선인 풍수들은 처형했지만, 시문용은 조선이 섬기는 상국(上國) 중국에서 온 무장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눈감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손들은 시문용의 무덤 자리가 ‘바늘이 매달린 형상의 명당(현침혈·懸針穴)’이라고 한다. “이곳을 현침혈로 보는 이유는 바늘처럼 길고 가는 능선에 맺힌 혈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이름을 날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이라기보다는 후손들이 편안하게 보신(保身)하며 살 수 있는 땅이다. 명나라가 망하고 이국 조선 땅에 살면서 후손들이 크게 화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시문용 자신이 찾았던 것 같다”라는 최낙기씨(선문대 강사)의 평이 흥미롭다. 실제 이곳 마을은 지금도 오지로서 난세의 보신지지(保身之地)로 적절한 땅이다.

서울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내려 신설동 방향으로 조금 걸으면 오른쪽에 동묘가 있다. 이곳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219년)을 모시는 사당(廟)으로 정식 명칭은 ‘동관왕묘(東關王廟)’다. 특이한 사실은 건축 양식이 우리 모양이 아닌 중국식이란 점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 왕실이 거의 파탄 지경에 있을 때 지어진 사당으로, 조성 배경에 풍수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
1592년 임진왜란에서 97년 정유재란으로 이어지는 긴 전쟁으로 인해 조선 전역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조정대신들은 당파를 만들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당시 선조 임금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정유재란을 끝으로 일본군은 철수했지만, 조선을 구원하러 온 명나라 군대가 도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조선을 구원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명나라 군대 역시 포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조정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다. 심지어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가 조선을 병탄(倂呑)할 계획이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왕실을 불안하게 했다.
선조 임금은 나라가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명나라 군대를 따라 입국한 중국인 풍수 섭정국(葉靖國)과 다른 조선의 풍수들에게 한양 도성의 문제점을 살피게 했다. 계속되는 난리와 당쟁은 한양의 지기(地氣)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 초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도성의 수구(水口·현재 동대문운동장 일대)가 다시 문제로 지적됐다.

풍수에서 말하는 수구란 좌청룡 우백호가 서로 마주하며 그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을 말한다. 한양의 경우 백호인 인왕산이 남산으로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 산자락이 현재의 광희문 부근에서 끝나고, 다른 한편으로 청룡인 낙산은 현재 동대문 부근에서 그 산 능선이 끝난다. 따라서 한양의 수구는 광희문과 동대문 사이에 해당하는데,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조선 초부터 이곳에 가산(假山·인공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이 수구의 결점을 보완했다. 도성의 지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관리 부족과 오랜 전쟁으로 나무는 없어지고 가산은 허물어져 있었다.
수구가 허한 곳에는 인공산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풍수책에선 또 다른 방법으로 사당(廟)이나 단(壇·제사나 치성을 드리는 곳)을 쌓는 것도 권하고 있다. 이에 선조 임금은 사당을 세울 자리를 중국인 풍수 섭정국과 조선인 풍수 박상의(朴尙義)에게 찾아보게 했다. 박상의는 현재 동묘가 있는 자리가 풍수지리서 ‘지리신법’에도 부합한다고 했고, 섭정국 역시 이 자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해 현재의 자리로 사당 터가 정해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관우 장군을 모신 사당이었을까? 중국 장수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장군인데, 당시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병돼 전투를 치를 때 관우가 꿈에 나타나 도움을 준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조정은 한양의 지기가 빠지는 곳에 관왕묘를 세워 풍수적으로 도성의 지기를 온전하게 하고, 조선에 주둔하던 명나라 군대를 달래고자 했다. 당시 이곳을 관우 장군 사당터로 정했다고 하자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 보고 흡족해했다는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명나라에 보고하니 명나라 신종(神宗) 황제도 이를 기쁘게 여겨 소요 비용과 친필 현판을 보내왔다. 그래서 사당은 1599년 착공돼 1601년에 완공됐다. 터잡기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중국이 합작한 작품이다. 동묘의 건축이 중국의 사당 모습을 띤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군대가 약소국에 주둔할 때 피해자는 약소국 백성이다. 당시 명나라 군대의 횡포가 오죽 심했으면 남의 나라 장군의 사당까지 지어서 잘 봐달라고 아첨했을까. 동묘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직후 초라한 조선 왕조의 눈물겨운 ‘풍수 외교’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향에서 천대받던 사람이 타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려 출신으로 원나라 순제(順帝)의 황후가 된 기(奇)씨가 대표적인 예다. ‘원사(元史)’에는 기황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황후 기씨는 고려 사람이다. 황태자 애유식리달엽(愛猷識理達獵)을 낳았다. 원래 집안은 미천했으나 후에 귀하게 되어 3대가 모두 왕작으로 추봉됐다.” 고려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의 어머니까지 됐으며, 또 그 덕분으로 친정집 삼대가 왕으로 추존됐으니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기황후는 원나라 말 30년간 원나라 황실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려 조정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더구나 몽고인이 아니면 황후가 될 수 없다는 금기까지 깨뜨리고 몽고제국의 황후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개인의 성공 사례로 이처럼 극적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어떻게 고려의 가난한 처녀가 원나라 황후가 됐을까? 한 개인의 성공에는 행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고려판 신데렐라’ 기씨 처녀의 경우에도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고와 노력이 있었다. 고려 말 기자오(奇子敖)의 딸로 태어난 기씨 처녀는 당시 상국인 원나라에 바쳐진 ‘조공 물품’ 가운데 하나였다. 1333년 8월 원나라로 끌려간 뒤 고려 출신 내시의 도움으로 황제인 순제에게 차를 올리는 일을 맡는다. 그리고 자신의 타고난 미모와 지략을 활용하여 순제의 총애를 받아 제2 황후가 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만큼 질시와 견제도 많아졌다. 제1 황후한테서 온갖 모욕뿐 아니라 심지어 매질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다.
기황후는 황실에서 모범적인 언행을 보였고, 자금을 모아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을 꾸준히 넓혀나갔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식량을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 그러나 이런 선행과 지지세력 확대만으로는 자신의 입지가 확실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여기서 기황후는 풍수가 목적하는 탈신공개천명(奪神工改天命•하늘이 하는 일을 빼앗아 천명을 바꾼다)을 시도한다. 황후가 되었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자 ‘북두칠성의 명맥이 비치는 삼첩칠봉(三疊七峰)의 산세를 갖춘 곳에 탑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어 천하의 이름난 풍수들을 동원해 찾게 한다. 여기에 고려 풍수사들도 동원됐는데, 마침내 제주도 동북 해변에서 바라던 자리를 찾았다. 기황후는 사신을 보내 오층탑을 쌓게 하고 극진한 기도를 올리게 한다. 이곳이 바로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에 있는 원당사(元堂寺•현재 불탑사) 오층석탑이다. 원당봉이란 산 이름도, 원당사라는 절 이름도 모두 원나라를 뜻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1339년 기황후는 원나라 황통을 이을 아들을 낳는다. 그 후 그녀는 원나라가 몽고 내륙으로 쫓겨갈 때까지 30년간 원나라의 실권을 장악한다. 1368년 명나라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자 기황후는 가족과 함께 몽고 내륙으로 철수한다. 그곳에서 아들이 황제로 즉위하는데 바로 소종황제(昭宗皇帝)다. 드디어 기황후는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후 원당사 오층석탑은 어찌됐을까? 아들을 못 낳은 수많은 고려와 조선의 여인들이 이곳에 가서 기도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세월의 변고 속에서 원당사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오층석탑은 그대로 남아 있어 아들을 얻기 바라는 이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다. 특이하게도 오층석탑은 입지가 조선시대 이후의 터 잡기 방식과 다르다.

조선 이래 터 잡기가 땅의 형세와 좌향만을 중시하는 반면, 이곳 오층석탑의 위치는 하늘의 방위와 별, 즉 천문을 중시한 흔적이 뚜렷하다. 오층석탑의 좌향이 산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북극성을 향하는 점도 그 예다. 즉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별의 기운에 따라 인간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천문사상(숙명론•宿命論)이 이곳 터 잡기에 반영된 것이다.

흔히 전라남도를 소개할 때 언급되는 글귀가 있다. ‘글 잘하기로는 장성만한 곳이 없고, 예절 바르기로는 보성만한 곳이 없으며, 지세 좋기로는 순천만한 곳이 없다(文不如長城 禮不如寶城 地不如順天).’ 또 시쳇말로 ‘여수 가서 돈 자랑 말고, 순천 가서 미인 자랑 말며, 벌교 가서 주먹 자랑 말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순천은 지세 좋고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흔히 순천을 삼산이수(三山二水)가 어우러진 빼어난 경치 때문에 중국의 강남에 버금간다 하여 ‘소강남(小江南)’이라 부른다. 순천 태생인 작가 서정인씨는 “순천에 미인이 많은 까닭은 물이 좋기 때문이다. 여수 큰아기(처녀)들이 순천으로 목욕을 하러 올 정도다. 그리고 차지철(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김재규(박정희 대통령 당시 중앙정보부장), 차범근씨(축구감독)의 부인이 모두 순천 출신이다”고 말했다.
땅과 그 땅 위에 사는 인간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가 풍수의 핵심 관념이긴 하지만, 한(漢)나라 초기 사상이 집대성된 ‘회남자(淮南子)’에서도 ‘땅은 각각 그 땅과 유사한 것을 낳으며, 사람이란 모두 그가 사는 곳의 기(氣)를 닮는다’고 했다.
이 같은 관념은 모든 풍수 관련 책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으로, 풍수 고전 ‘지리신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산이 아름다운 형상이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기가 있고, 그 산의 기를 받는 자는 아름답게 마련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인이 나올 만한 조건을 갖춘 땅으로, ‘살아 숨쉬는 흙(息土)’이라고 단정했다. 물이란 본래 자신의 맛이나 청탁(맑음과 흐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 있는 땅’에서는 당연히 ‘생수(生水)’가 흐르게 마련이다. 순천의 물이 좋아 미인이 많다는 말은 곧 순천의 땅이 좋다는 뜻이다. ‘지세 좋기로는 순천만한 곳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반대되는 땅, 즉 죽은 땅에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당연히 미인과 반대인 추한 사람이 나온다고 ‘지리신법’은 적고 있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땅이 파괴되고, 각종 오염원에 의해 죽어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당연히 파괴적이고 추악한 인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풍수는 땅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여기고, 살아 있는 땅을 아름답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그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아름다운 품성을 지녀 상생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순천이 미인을 많이 배출하는 아름다운 땅이라 해서 완벽한 땅은 아니다. 풍수에서는 제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도 흠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아름다운 순천에도 흠이 있다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순천의 풍수적 흠을 말해주는 문화재가 몇 있는데, 현재 순천시청 앞으로 옮겨져 있는 ‘장명석등(長明石燈)’과 순천경찰서 뒤 ‘향림사’가 대표적이다. 몇 년 전 순천시청 앞 장명석등을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순천의 지형이 좋기는 하나 약간 험하고 어둡다는 풍수적 견해가 있어 순천남초등학교 옆 오거리에 세운 것이다’고 쓰여 있었다. 최근 바뀐 안내판에는 ‘험하고’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아마도 ‘험하고’라는 표현이 좀 거슬렸던 듯하다.
그러나 ‘험하고 어둡다’는 표현이 있어야 두 문화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다. 순천 향림사 입구에 서 있는 비문에 ‘순천의 지형 지세가 여기저기 서로 부딪치고 쏘는 듯한 감(沖射之嫌)이 없지 않아 이를 진압하기 위해 향림사를 세웠다’고 적혀 있어 ‘험하다’는 의미를 잘 읽을 수 있다.
또 순천의 옛 지명 가운데 하나가 구덩이 감() 자(字)를 써서 ‘감평군’이었던 점을 보면 순천의 지형을 꺼진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지형이 꺼져 있으니 어두울 테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 석등을 설치했을 것이다. 전형적인 비보풍수(향림사와 장명석등) 흔적이다.
이미 옛사람들은 순천의 문제점을 알고, 비보풍수로 후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듯하다. 순천시청 앞의 장명석등을 설명하는 안내판을 다시 설치하고, 실제로 그곳에 불을 밝혀두는 게 어떨까? 더 많은 미인이 배출되도록.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지로 장성의 필암(筆巖)서원이 있다. 이곳은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1510~60)을 배향(配享)한 곳이다. 바로 가까운 곳에 하서가 태어난 맥동마을과 하서가 직접 자리를 잡은 부모 및 자신의 묘가 있다. 안동 도산서원 일대가 퇴계 이황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필암서원 일대는 하서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다. 전북대 김기현 교수는 하서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율곡 이이의 붓 아래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石潭筆下無完人·石潭은 이율곡의 또 다른 호). 그렇게 인물을 평함에 인색하기 짝이 없던 이율곡조차도 하서 선생을 평하여 ‘淸水芙蓉 光風霽月(맑은 물에 뜬 연꽃이요, 화창한 봄바람에 비 온 뒤의 달)’이라고 할 정도였다. 호남 유학사에서 독보적 존재다.”
하서를 배향한 필암서원에 쓰여진 ‘필암’은 글자 그대로 ‘붓 바위’란 뜻이다. 필암, 필암서원 그리고 하서 김인후 선생은 풍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풍수 용어 가운데 필봉(筆峰) 또는 문필봉(文筆峰)이란 것이 있다. 필봉이란 이름을 가진 땅은 전국에 여러 곳 있다. 산의 생김새가 마치 붓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필봉의 지기를 받아 태어나는 사람은 훌륭한 학자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반듯한 필봉이나 문필봉이 있는 마을에서 선생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찮게 들린다.

필봉은 있으나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뒤틀려 있으면 훌륭한 선생이 되지 못하고 곡학(曲學)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풍수에서는 바위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데, 바위는 지기가 강하게 응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 또한 강하거나 신속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바위가 다 좋은 지기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바위의 생김새가 지나치게 크거나 험하면 기운 또한 그와 같아 그곳에 사는 사람이 미치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풍수가들은 풀이한다. 무덤이나 집터 근처에 지나치게 크거나 사나운 바위를 피하는 것도 이와 같은 까닭에서다.
바위 모양이 단정하거나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풍수에서는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풍수에서는 자연의 형상과 사람됨의 관계를 유비적(類比的)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필암서원이란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일대가 필암리이기 때문이다. 필암서원과 필암리란 이름을 가져다준 필암, 즉 붓처럼 생긴 바위는 어디에 있을까? 필암서원 근처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필암은 필암서원에서 조금 떨어진 맥동마을 입구에 있다. 맥동은 하서가 태어난 마을이자, 무덤이 있는 곳이다. 이 마을 좌청룡 끝부분이자 마을 입구에 그리 크지는 않으나 강단져 보이는 붓 모양의 바위가 있고, 바위에 ‘筆巖’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풍수에서는 ‘붓 바위의 지기와 소응(昭應)하면 장차 위대한 학자가 나온다’고 풀이한다. 마치 19세기 미국 작가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년이 큰 바위 얼굴과 소응하여 나중에 위대한 현인이 되는 것처럼, 붓 바위가 있는 이 마을에서도 언젠가 그와 같은 위대한 현인이 나올 것이라는 풍수적 설명이다.
위대한 유학자로서 하서는 천문, 지리, 의약, 복서(卜筮) 등에도 능통했다고 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 절차에 따라 집의 서쪽 원당산에 직접 터를 잡아 모셨다. 그의 무덤 역시 부모 무덤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풍수관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잡은 무덤 터의 가장 큰 특징은 주산이 일자(一字) 모양으로 후덕하되, 주산에서 무덤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굵게 뻗어 내려온 점이다. 필암서원 누각 ‘확연루(廓然樓)’가 말해주듯 확연대공(廓然大公)한 대인의 후덕한 인품을 보여주는 터잡기다. 그의 생가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다. 마을 입구 붓 바위는 그렇게 후덕한 산을 배경으로 솟아난 날카로운 붓과 같다. 이들이 모두 하서를 있게 한 자연물이다.

이장(移葬)을 하려고 봉분을 열어보니 유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관의 위치가 봉분과 어긋나 있어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다. 유골이 없는 경우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하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 광중(壙中)의 흙 일부를 유골로 삼아 이장하기도 한다.
풍수에서는 이를 ‘시체가 도망하는 자리’라는 뜻의 도시혈(逃屍穴)이라고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말이 있어왔다. 조선시대 지관 선발시험의 필수과목이자 지금도 많이 읽는 ‘청오경’에서는 관이 뒤집혀지거나 부서지는 원인을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산 어느 곳에 골이 지면 그렇다고 했다. 또 땅 밑으로 물이 흐를 때도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유골이 없어진 경우, 유골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힘든 방법들이다.

현대 지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토양포행(soil creep)’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토양포행이란 ‘암반층 위에 연약지층이 형성된 경우 표토(表土)는 나무나 잡초뿌리와 풍화작용으로 단단하나 중간에 있는 연약지층은 암반의 경사에 따라 이동’(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지표층 아래 일정 지층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그 위에 놓여진 관이 함께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교수는 경기도 금곡에 있는 고종 황제의 무덤인 ‘홍릉’이 도시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이 의도적으로 도시혈에 조선의 황제 무덤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다.
무덤뿐만 아니라 전봇대나 교각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고서도 지표층 아래 지층이 흘러감을 알 수 있는데, 사진 쥱도 하나의 예다. 몇 년 전 필자가 안동에서 찍은 사진인데, 정면에서 보아 왼쪽 교각 3개가 일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이곳에 교각을 설치할 때는 지표층 아래 지층, 즉 토양포행이 진행되는 지층의 움직임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교각판 아래의 교량 상층 부분은 교각판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땅에 박혀 있는 교량 밑바닥 부분은 토양포행이 진행되는 지층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점차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무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더 빈번하게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무덤이 경사진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고, 또 외부 기후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지표면 1m 내외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사진 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쥳에서는 일정한 영역의 소나무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또 그 아래 몇 기의 무덤도 보인다.
이 경우 소나무가 기울어져 있는 부분에 쓰여진 무덤의 유골들 역시 ‘도시혈’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처음 작은 소나무들을 이곳에 심었을 때 뿌리가 깊지 않아 토양포행이 진행되는 지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점차 소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도 그만큼 깊어져 토양포행이 진행되는 지층에 뿌리가 닿게 된다.
이 경우 뿌리는 흘러가는 지층과 함께 밑으로 밀려가고, 반대로 그 위에 소나무 줄기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진다. 일정 지대 밖의 소나무들은 반듯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소나무들은 토양포행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혈에 무덤을 쓰면 어떻게 될까? 유골이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사라졌을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중의 유골 상태가 안 좋으면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관념으로 인해, 살아 있는 후손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이다. ‘잘되면 자기 탓이지만 못되면 조상 탓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곳을 다시 답사해보니 무덤 왼쪽 능선에 전에 없던 돌탑이 두 개 세워져 있었다. 아마도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어 쌓은 듯하다.
서울 도심의 ‘효창원’
정조 임금 만들고 김구 선생 묻히고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으로 알려져 있는 ‘효창원(孝昌園)’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천하의 명당’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순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안장된 곳이다. 효창원과 효창공원, 그리고 효창운동장은 같은 장소를 두고 달리 부르는 이름들이지만 효창원을 빼고는 역사적으로 그리 기분 좋은 이름이 아니다. 언젠가는 없애야 할 이름들이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효창원은 원래 정조 임금이 잡은 자리다. 정조 임금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기 위해 15년 넘게 풍수를 공부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풍수 공부를 했는지 ‘홍재전서’에 적고 있다.
“처음에는 옛사람이 풍수지리를 논한 여러 가지 책을 취해 전심으로 연구한 결과 종지를 얻은 듯했다. 그래서 역대 조상 왕릉의 용혈사수(龍穴砂水)를 가지고 옛날 방술을 참고해보았더니, 하자가 많고 길격은 하나도 없었다.”
정조 임금에게도 뜻밖의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난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문효세자(文孝世子·1782∼86)가 다섯 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것이다. 정조는 죽은 아들을 좀더 가까이에 두고 싶어 궁궐에서 가까우면서도 길지(吉地)인 효창원에 아들을 묻는다.
몇 달 뒤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성씨(宜嬪成氏)가 또 갑자기 죽는다. 더구나 의빈성씨는 임신을 하고 있었다. 정조 임금은 문효세자 바로 옆 능선에 의빈성씨를 묻어 죽어서나마 모자(母子)의 정을 나누기를 바랐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효창원은 지금의 효창동과 청파동 일대에 걸쳐 아름다운 숲을 형성했다.
그런데 19세기 말 일본 군대가 지금의 효창운동장 남단의 솔밭에 주둔하면서부터 이곳을 훼손하기 시작했고, 1924년에는 이곳 일부를 ‘효창공원’으로 만들어버렸다. 또 일제는 문효세자와 생모의 무덤을 모두 서삼능으로 옮겨버림으로써 조선시대 최고 성군 정조 임금이 만든 효창원을 없애버렸다.
이 자리를 다시 주목한 이가 백범(白凡) 김구 선생이다. 백범은 한때 관상가나 지관이 되고자 한 적이 있었다. 글공부로 양반 되기는 이미 그른 세상인 줄을 깨달은 소년 백범에게 아버지가 풍수나 관상을 공부해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수를 잘 배우면 명당을 얻고 조상님네 산수를 잘 써서 자손이 복록을 누릴 것이요, 관상에 능하면 사람을 잘 알아보아서 성인군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백범일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백범은 관상 공부를 시작하지만 자신의 관상이 흉상임을 알고서 크게 실망한다. 소년 백범은 ‘相好不如身好 身好不如心好(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라는 문장 하나만을 마음에 새긴 뒤 관상 공부를 그만두고 풍수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에도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해 풍수서 몇 권 보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지만 인식능력이 뛰어난 그가 풍수의 대강을 파악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백범은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일본에서 고국 땅으로 모셔 문효세자의 옛 무덤 터에 국민장으로 안장한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이곳에 안장하려고 가묘를 만들어두었다. 이어 1948년에는 중국 땅에서 순국한 이동녕·차리석·조성환 선생의 유해도 의빈성씨의 옛 무덤 터에 안장했다. 백범 자신은 49년 암살된 뒤 이곳 북서쪽 능선에 안장된다. 그렇게 해서 효창원이 자연스럽게 부활됐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이장을 추진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덤 이전은 보류됐으나 효창원의 규모와 경관이 훼손되는 일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아시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묘소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일본이 이곳에 효창공원을 만들었다면, 해방 이후 정부는 효창운동장을 만들었다. 잠실·상암운동장과 같은 대형 운동장이 있는 만큼 이제는 효창운동장을 없애고 효창원의 옛모습을 복원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안산공단’으로 더 잘 알려진 경기 안산시 목내동 472-1번지(14블럭)에 가면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 정문 바로 옆에는 관우물지라는 표석이 있는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적혀 있다.
‘목내동 능 안에 있던 소능(昭陵)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를 모셨던 능이었다.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세조가 단종을 죽이려 할 때 세조의 꿈에 나타나서 꾸짖자 크게 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관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후 현덕왕후의 관이 처음 도착한 바닷가는 뒤에 육지가 되어 우물이 생겼다. 이곳을 관이 닿았던 자리라 해서 ‘관우물’이라 불렀다.’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史實)은 아닐지라도 세조가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에게는 형수이기도 한 현덕왕후 권씨의 무덤을 파헤쳐 없애버린 일은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런데 현덕왕후 무덤이 안산의 이 자리(소릉)로 정해질 때 이에 대해 불길한 의견을 개진한 풍수학인이 한 명 있었다. 그는 이 자리가 나빠 장차 자손이 절명하리라는, 차마 임금에게 전할 수 없는 대단히 불경스러운 예언을 한다. 그러한 불행한 예언은 훗날 그대로 현실이 된다. 단종의 어머니 무덤과 풍수에 얽힌 불행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세종의 며느리 현덕왕후 권씨는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죽었다. 장손을 낳아준 권씨를 불쌍히 여긴 세종은 길지 가운데 길지를 찾으라는 명을 내린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곳이 안산 목내동 관우물 근처였다. 이때 전농시(제향에 쓸 곡식을 관리하던 관청) 소속의 노비 목효지(?~1455)가 세종에게 장문의 상소를 올려 그곳이 나쁜 땅이라고 아뢴다. 다음은 상소문의 요약이다.
‘주산에서 혈장(무덤 쓸 자리)으로 이어지는 산능선(내룡)이 약하고 끊어진 곳이 많아 장차 후손이 없어질까 두려우며, 청룡(무덤 왼쪽을 둘러싸는 산)이 혈장을 감싸지 못하여 특히 아들에게 불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덤의 좌향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옛 읍터나 장터는 무덤 터로 적당하지 못한데, 이곳은 안산의 고읍(古邑)이기 때문에 이 역시 금기사항을 범한 것입니다.’
이곳에 무덤을 쓰면 ‘왕손의 대가 끊긴다’는 천한 노비의 상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글을 현직 대통령에게 올린다면 그 글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더구나 일개 노비의 상소라면 그저 웃어넘기고 불쏘시개로 쓰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노비의 글은 그대로 세종에게 전해진다. 글을 읽은 임금은 그날로 우의정, 예조판서, 도승지 안평대군에게 다시 살펴보되 문제점이 드러나면 다른 곳을 찾으라고 명했다. 왕명을 받은 이들은 현장을 답사하고 목효지의 주장 가운데 좌향이 잘못되었다는 점말고는 취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올린다.
조정에서는 일개 노비가 무덤 터에 대해 잘못을 알았으면 해당 관청(풍수학)이나 예조에 올려야지 함부로 임금에게 글을 올렸다고 하여 벌을 내릴 것을 청한다. 그러나 임금은 목효지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주고 풍수 공부에 전념하게 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세종이 목효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좌향만 조금 바꾸어 현덕왕후 권씨를 안장한다. 그곳이 바로 소릉이다.
그 후 불길한 예언대로 현덕왕후의 아들 단종은 죽음을 당하여 대가 끊겼으며, 왕후의 무덤 또한 파헤쳐졌다. 단종의 불행을 예언한 노비 풍수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신안(神眼)의 풍수 실력을 가진 그도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지는 못했다. 세종대에서 단종대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왕실 풍수에 관해 발언을 해오다 수양대군의 미움을 산다.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직후인 1455년 목효지를 교수형에 처했다. 특별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천기를 누설한 탓이다. 그로부터 300년이 훨씬 지난 1791년 정조 임금은 목효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현덕왕후의 관이 닿았다는 관우물 터 표석.


충남 금산읍과 이웃한 제원면 천내리 강변에는 호랑이와 용을 새긴 길이 1.5m의 석상이 있다. 석상에 문외한일지라도 재질이나 생김새의 품격에 찬탄이 절로 나오는 완벽한 예술품이다. 금산읍과 제원면 천내리를 이어주는 ‘제원대교’ 다리에서 보면 곧바로 보인다. 용이 새겨진 ‘용석(龍石)’은 꿈틀거리는 몸체와 여의주를 문 모습으로 남쪽을 쳐다보고 있으며, 그곳에서 500m쯤 떨어져 있는 호랑이 석상(虎石)은 앞발을 세우고 몸은 서쪽을, 머리는 북쪽을 향해 앉아 있다.
언제 무슨 까닭으로 ‘용호석(龍虎石)’이 이곳에 세워졌을까?
“공민왕이 홍건적 침입을 피해 안동으로 피난 왔다가 이곳의 훌륭한 명당 터를 보고 자신의 능 자리로 잡아뒀는데, 난이 평정되자 개경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그대로 방치했다는 전설을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주민 황운학씨(70)가 전해준다.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공민왕이 안동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금산까지 들렀다는 기록이 없어 ‘용호석’에 대한 진실은 가리기 어렵다. 그렇지만 ‘용호석’의 조성 시기를 고려 말이나 조선 초로 추정하고 있고, 또 용호석이 매우 세련된 예술품임을 감안하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공민왕과 용호석이 풍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역사에서 패자는 늘 나쁜 점이 부각돼 전해진다. 고려 공민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시해를 당한 것도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고려를 멸한 조선이 ‘고려사’를 다시 쓰면서 그의 좋은 점들을 일부러 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서술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공민왕은 대단한 인격과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원나라 노국 공주와 결혼한 뒤 왕이 되어 귀국한 공민왕(생존 1330∼74, 재위 1351∼74)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고려를 부흥시키기 위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원나라 기황후(주간동아 440호에 소개)를 등에 업고 설치던 기철(奇轍) 등 친원세력을 제거해 왕권 회복을 꾀하고, 원나라에 점령당한 철령 이북 땅을 되찾아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다. 또 승려 신돈(辛旽)을 내세워 권신들을 축출하고 신진사대부를 등용했으며, 토지의 재분배를 시도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시해를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혁명에 가까운 개혁정치를 시도한 공민왕은 풍수지리를 하나의 개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의 풍수 실력은 당대 최고였다(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의 평). ‘고려사’에 기록돼 있는 토목공사, 사랑했던 왕비 노국 공주의 무덤터 선정과 단장, 개경의 지기가 쇠했다는 이유로 세운 평양 및 충주 천도 계획 등에서 풍수 식견을 엿볼 수 있다. 평양이나 충주로 천도를 꾀한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기반을 약화해서 개혁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처음부터 평양과 충주 두 곳만을 천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도읍지를 위해 전국의 좋은 땅을 수소문하거나 해당 관리를 시켜 찾아 다녀보게 했을 것이다.

충남 금산 일대는 도읍지로 손색이 없을 만큼 드넓은 땅과 이를 병풍처럼 감싸주는 높은 산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 있는 곳이다. ‘용호석’ 터는 공민왕 자신의 능 자리가 아니라 여러 천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용호석’은 일종의 후보지 표지석인 셈이다. 풍수에서는 대개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라 하여 핵심처의 왼쪽에 용의 형세, 오른쪽에 호랑이 형세의 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용호석’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천내리와 그 뒤로 이어지는 구릉지대를 핵심처로 본 듯하다. 앞으로는 금강이 휘감아돌고, 뒤로는 성주산(623m) 월영산(529m) 양각산(565m) 등이 감싸며, 강 건너 금산읍의 드넓은 들판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땅이다

서울에서 ‘천하의 명당’을 볼 수 있는 데가 두 곳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당’이란 풍수에서 말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좋은 땅으로, 그곳에 무덤을 쓰거나 살면 복을 받는 땅을 말한다.
서울 도심 한복판 어디에 그러한 명당이 있을까?
하나는 동작동 국립묘지이고, 다른 하나는 효창운동장 부근의 효창원이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승만, 박정희)과 국무총리, 장관, 장군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일반 장병들의 영혼이 안장된 곳이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해방 이후 정부인사들의 무덤이라면, 효창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해방 이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안장된 곳이다. 규모에 차이가 있지만 두 군데 모두 ‘국립묘지’인 셈이다.
원래 이 두 곳은 왕릉이었다. 조선시대 왕릉 입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풍수지리였다. 대개 왕릉 터를 잡을 때에는 풍수에 능한 조정대신, 풍수전문 관료인 지관, 그리고 왕실을 대표하는 종친들이 현장을 직접 몇 번씩 가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대부분이다.
흔히 동작동 국립묘지를 이승만 대통령의 명으로 1950년대 초에 터 잡기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소개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450년 전 ‘동작릉’이 있었다. 동작릉의 원래 주인은 TV 사극 ‘여인천하’에도 등장한 창빈 안씨(昌嬪安氏, 1499~1549)다.
창빈은 조선 11대 임금 중종의 후궁으로 중종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둘째 아들이 덕흥군이고, 덕흥군의 막내아들 하성군(河城君)이 훗날 선조 임금이다.
이와 관련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1549년 10월 창빈이 죽자 처음에는 경기도 양주 장흥 땅에 모셨다. 그러나 터가 좋지 않아 이듬해에 서울 동작동으로 이장하고 능의 이름을 동작릉(銅雀陵)이라 불렀다. 이곳 동작릉에 창빈을 안장한 뒤 덕흥군은 막내아들 하성군을 얻었다(1552년). 당시 임금은 문정왕후 소생인 명종. 아들이 없었던 명종은 조카들 가운데 하성군을 특히 총애해 궁궐에 자주 불렀다. 명종이 붕어하자 하성군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바로 선조 임금이다(1567년). 이렇게 후궁의 막내 손자가 임금이 되자, 동작릉의 명당발복 때문이라는 소문이 난 것이다.

실제 창빈이 묻힌 동작릉은 풍수적으로 좋은 땅일까?
동작릉을 찾아가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립묘지 정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로 가면 왼쪽에 비교적 넓은 주차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 ‘창빈 안씨’ 묘소를 알리는 안내표지와 창빈 안씨의 신도비가 보인다. 신도비에서 20m쯤 올라가면 곡장(曲牆)이 둘러처진 창빈 안씨의 무덤이 단아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가운데에 위치한 창빈 안씨의 무덤은 풍수에서 말하는 혈처(穴處)다. 정문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산들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다. 동작릉은 바로 그 날개 속에 감싸인 알의 형상이다. 동작(銅雀)이란 위나라 조조가 구리로 만든 봉황새를 옥상에 올려두었다는 동작대(銅雀臺)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작이란 곧 봉황을 의미한다. 지형지세를 사물의 형세에 비유해 표현하는 것을 물형론(형국론)이라고 한다. 이곳을 물형론에 대입해보면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의 땅이다.

창빈 안씨 무덤 뒤로 이어지는 산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내각 수반, 장관, 유명인사, 장군들이 안장된 작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다. 동작동 국립묘역에서 창빈 안씨 무덤 다음으로 좋은 지기가 뭉쳐 있는 곳이다. 동작릉과 이곳을 중심으로 좌우와 앞쪽으로 수많은 애국자들의 무덤들이 늘어서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왕릉과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가 서로 갈등 없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곳말고도 서울 근교에는 많은 왕릉들이 있다. 이중에서 몇 군데는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해 살다간 애국자의 묘역으로 활용해보는건 어떨까?

서울과 판교 톨게이트
중간 지점에 ‘달래내 고개’라는 곳이 있다. 교통방송에서 고속도로 상황을 전할 때 가끔 정체구간으로 언급되는 곳이다. 지금은 서울과 삼남(충남·영남·호남)을 잇는 가장 큰 도로가 되었지만, 조선시대 때는 한양과 삼남 지방을 잇는 좁은 길로 겨우 달구지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고갯길 하나가 무려 35년 동안 조선 조정과 왕실의 큰 논란거리가 된 일이 있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 세종 12년(1430) 풍수학자인 최양선이 한 장의 상소를 올린다. 요점은 ‘태종의 무덤인 헌릉(獻陵, 현재 서울 서초구 세곡동 국정원 옆에 소재)의 내룡, 즉 주산에서 혈장에 이르는 산능선이 ‘천천현(穿川峴)’이란 고갯길에서 끊어지는데, 만약 그대로 둘 경우 왕실의 후손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으므로 고갯길을 막아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이 바로 높은 산에서 무덤이나 집터로 이어지는 산능선(龍)이다. 이 산능선이 패어나가거나 끊어지면 지기(地氣)가 흐르지 않아 후손이 끊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왕손의 번창과 왕업의 무궁무진한 계승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금으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날로 세종은 해당 관청인 예조로 하여금 최양선의 글을 논의케 한다. 예조에서는 ‘고갯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은 풍수상 오히려 귀한 땅임을 의미한다’고 하여 고갯길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세종은 다시 이번에는 예조가 아니라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에게 천천현 고갯길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도록 지시한다. 조정에서는 조선 건국 때부터 한양 정도(定都)를 비롯해 왕실 풍수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여 태조뿐만 아니라 태종, 세종에 이르기까지 신임을 받아오던 원로 지관 이양달에게 자문한다. 이양달 역시 “고갯길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힌다.
그러자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풍수지리 서적들을 참고하여 천천현을 막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시비를 가리도록 한다. 집현전 학자들은 3년의 연구 끝에 방대한 분량의 연구결과를 임금에게 올린다. 집현전 학자들의 결론은 ‘헌릉으로 이어지는 천천현은 풍수에서 기가 뭉쳐 지나가는 벌의 허리(蜂腰)와 같은 곳으로 막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고갯길이 계속 훼손되면 왕실에 불상사가 있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천천현 통행에 대한 허용과 금지가 반복되었다. 결국 성군이었던 세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 임금인 문종에게 넘겨진다. 문종은 1451년 천천현을 직접 둘러본 뒤 대신들을 불러 논의를 하게 하지만 끝내 결론을 얻지 못한다.

단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는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어서(御書)를 내려 고갯길을 막아버리게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반론과 민원제기가 심해지지만 세조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당시 서운관 책임자인 이순지가 ‘천천현에 잔돌(薄石)을 깔아 고갯길이 더 이상 파이는 것을 방지하되 사람과 우마의 통행을 허용하자’는 타협책을 제시해 채택된다. 1430년 ‘천천현’ 문제가 제기된 후 35년 동안 통행의 금지와 허용이 반복되다가 1464년 논쟁이 끝을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이 돼온 천천현은 과연 어디일까. 그 사이 ‘천천현’은 ‘월천현(月川峴)’ ‘달래내 고개’ 등으로 지명이 바뀌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지리학을 전공한 한동환씨(은행 근무)가 청계산과 인릉산 사이의 고개, 즉 지금의 ‘달래내 고개’라고 알려주었다. 답사를 해보니 과연 세종에서 세조에 이르기까지 30여년 논쟁이 붙은 ‘천천현’과 상황이 맞아떨어졌다. 최근 천성산 및 사패산 터널공사를 두고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천천현 35년 논쟁’을 참고하면 어떨까.
땅에 대해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다양하고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

호남의 대표적인 명가 고택 가운데 하나인 운조루(雲鳥樓,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다. 운조루는 입향조 류이주(柳爾胄, 1726~97)가 삼수 부사를 지낸 뒤 풍수적으로 길지(吉地)임을 확인하고 들어온 땅으로(1776년) 조선 후기 터잡기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류이주가 이곳을 길지라고 확신한 까닭은 강 건너 오봉산이 아름답고, 사방의 산들이 다섯 가지 모양(五星)을 갖추었으며, 물이 풍부하고, 풍토가 후덕하며, 대지(垈地)가 거처하기에 좋다 등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터잡기 기준은 이보다 20년 앞서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이중환의 ‘택리지’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비교가 된다. 이중환은 ‘집터를 정하는 데 가장 먼저 수구(水口)가 닫혀 있는가를 살피고, 다음으로 들판의 형세와 사방의 산, 흙 색깔을 보라’고 하였다. 이중환과 류이주가 터잡기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은 수구(水口)다. 운조루는 수구가 닫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환의 관점에서 보면 터잡기의 큰 금기사항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이곳 오미리에는 3개의 명당 터가 있다고 전한다. 첫 번째가 금거북이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금구몰니형(金龜沒泥形), 두 번째가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지는 금환낙지형(金環落地形),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보물(금·은·산호·진주·호박)이 모이는 오보교취형(五寶交聚形)이다. 이 가운데 운조루는 금구몰니형이고, 아래 춘해루(春海樓)가 금환낙지형이라 한다. 금환낙지형의 집터는 원래 만석꾼 박참봉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주인이 이씨로 바뀌었다(마을에 살고 있는 류맹효 전 교장 증언).
춘해루에는 금가락지 모양의 담 안에 대나무를 심고, 그 안에 다시 탱자나무를 심었다. 담은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도 금가락지 모양을 형상화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뒤꼍의 대나무와 탱자나무는 무슨 까닭으로 심었을까? 물론 대나무는 농경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마을 뒷산 너머의 작은 봉우리 두 개에서 찾을 수 있다. 풍수에서는 이를 규봉(窺峰)이라 하여 꺼리는데, 아마도 이를 가리기 위해 대나무를 심은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류이주의 풍수 실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운조루와 춘해루말고도 오보교취형의 명당이 이 마을 어디엔가 있다고 한다. “해방 전 이곳에는 오보교취형의 명당이라고 믿고 들어온 집들이 12가구나 있었는데, 운조루나 춘해루보다 웅장했다.” 오보교취형의 명당을 찾기만 하면 저절로 부귀영달한다는 소문만 믿고 찾아와 집을 짓고 산 사람들은 명당발복의 효험이 없고, 가지고 온 재산마저 탕진하자 ‘풍수에게 속아 수천금을 주고 왔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고 류교장은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이곳이 해방 전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명당 열풍에 휩싸인 적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일본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1929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미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100여호의 집들이 있었고, 또 십수호의 집들을 짓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운조루와 춘해루만이 옛 모습을 부지하고 있을 뿐 이전의 집터는 모두 논으로 바뀐 지 오래다. 시대 흐름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풍수전문가들은 이곳 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택리지’에서 강조하는 수구(水口)가 닫히지 않았다는 점을 드는가 하면, 마을 뒷산이 이곳 오미리를 감싸지 않고 구례읍 쪽에 있는 사도리(沙圖里·도선국사의 전설이 깃든 마을) 쪽으로 돌아앉았으므로 산의 얼굴(面)이 아닌 등(背)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당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이곳 운조루와 춘해루에서 과거 급제자가 여럿 나왔고, 만석의 재산을 유지한 것으로 보면 명당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운조루와 춘해루 터가 있는 오미리 마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선 후기 사대부의 터잡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풍수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육장임이 틀림없다.

“참의 윤선도는 호가 고산인데 세상에서 오늘날의 무학(無學)이라고 부른다. 풍수지리 학문에 관해 본래 신안(神眼)의 실력을 갖추었다.”
고산 윤선도에 대해 풍수의 최고 단계인 ‘신안’이라고 극찬한 사람은 당대 최고의 풍수학자이기도 한 정조 임금(주간동아 353호와 448호에 소개됨)이었다.
문학가로 더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1587~1671)는 풍수학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명당으로 알려진 그의 고가(전남 해남 녹우당)와 무덤엔 지금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풍수지리에 정통한 고산은 효종이 승하하자 좌의정 심지원의 추천으로 왕릉 선정에 참여한다. 그는 여러 곳을 답사하고 난 뒤 수원 땅을 최고의 길지로 추천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송시열, 송준길 등이 반대했기 때문. 훗날 정조는 고산이 추천한 곳의 진가를 알아보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곳으로 이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수원 옆 화성의 융릉(隆陵)이다.
정조가 ‘신안’으로 인정한 고산의 풍수학맥은 이의신(李懿信, 윤선도와 인척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됐다. 이의신은 해남 맹진 출신으로 1600년 선조 임금 어부인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떴을 때 왕릉 선정에 참여하면서 선조에게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광해군 때는 경기도 파주 교하로 도읍지를 옮기자는 ‘교하 천도론’을 주장해 몇 년 동안 조정을 발칵 뒤집어놓은 장본인이다.
이러한 이의신와 고산 사이의 ‘명당 빼앗기’ 전설은 이 고장뿐만 아니라 풍수가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이 고산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밤중이면 몰래 말을 타고 집을 빠져나가 새벽녘이면 슬그머니 돌아오곤 했다. 고산은 이의신이 명당을 찾았음을 짐작하고 어느 날 그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일찍 잠에 빠지게 했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고산은 평소 이의신이 타던 말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말은 밤중이면 언제나 가곤 하던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어느 지점에 멈추었다. 자리를 살펴보니 과연 천하의 명당이었다. 고산은 주변에서 썩은 나무막대 하나를 찾아 그 자리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고산은 이의신에게 자신이 잡아놓은 자리가 하나 있으니 한번 봐달라고 했다. 이의신이 따라가본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잡아놓은 자리였다. 이의신이 ‘명당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면서 고산에게 양보하였다.”
전설은 상당 부분 사실인 듯하다. 우선 “녹우당에서 고산 무덤이 있는 금쇄동까지 걸어서 1시간 반 거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 걸어서 많이 참배를 하였다”는 고산의 종손 윤형식(녹우당 거주) 선생의 말씀과 전해지는 이야기에 나오는 거리가 비슷하다.
그러나 전설처럼 고산이 이의신의 자리를 빼앗았다기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은 이의신에게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를 추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로 서얼 출신인 이의신이 금쇄동(고산 묘역 일대)을 사들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쇄동의 면적은 120여만평으로서 지금까지 종가 소유로 전해온다.


최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책과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고 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도 일부러 왜군의 총에 맞았다는 ‘의도적 자살설’이나 전쟁이 끝난 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둔생활을 했다는 ‘은둔설’ 등이 떠돌고 있다.
이런 설이 나도는 배경은 당시 선조 임금의 처지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그에게 민심이 쏠리지 않을까 하여 극히 경계했을 것이고, 조정 대신들 또한 무장(武將)이 실세로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고려 왕조가 무장 이성계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선조 임금은 충분히 예측했고, 충무공 역시 당시 임금이나 조정 대신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조는 충무공의 업적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왜적을 평정한 것은 모두 명나라 군대 덕분이다. 우리 장사들은 명나라 군대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요행히 패잔병의 머리를 얻었을 뿐, 일찍이 적장 머리 하나 베거나 적진 하나 함락시킨 적이 없었다. 그 가운데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의 해상 승리와 권율의 행주대첩이 다소 빛날 뿐이다.”
몰락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한 사람은 성웅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과 권율 등 다른 장군들이고, 이순신은 단지 그들과 함께 ‘전쟁에 조금 기여했을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그런데 풍수와 관련, 왕실과 충무공 사이에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하다. 당시 선조 임금은 “우리나라엔 본래 술사가 없는데 어찌 지맥에 능통한 지관이 있겠느냐”며 조선의 풍수를 무시한 반면, 명나라 군대를 따라 입국한 중국인 풍수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다.
흥미로운 것은 충무공 역시 중국인 풍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원래 천문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지리에도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충무공의 15대 직계 후손 이재엽씨는 말한다.
충무공이 교유관계를 맺은 중국인 풍수가는 두사충(杜師忠 주간동아 382호에 소개)이었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충무공이 전사할 때까지 오랜 기간 교유했는데, 충무공이 두사충에게 준 ‘두복야(‘복야’는 관직명)에게 드리는 시(奉呈杜僕射)’가 지금도 전해진다. 물론 충무공과 두사충의 만남이 왜군에 대한 공동전선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수가 일차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둘 사이에 풍수가 자주 화젯거리가 되었다. 그것은 충무공이 죽었을 때 두사충이 직접 아산에까지 와서 무덤 자리(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마을 뒤)를 잡아준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후 충무공 후손들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는데, 7대손 이인수(삼도통제사 역임)가 두사충을 위한 신도비문을 쓰기도 했다. 신도비문에서 그는 ‘충무공의 묘지 소점’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한 충무공의 무덤은 그로부터 16년 뒤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다.
당대 최고 풍수이자 오랜 친구가 잡아준 자리를 버리고 굳이 이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리가 나빠서였을까? 만약 그랬다면 훗날 충무공의 손자가 다시 그 자리에 묻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역화되기 이전의 현충사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재엽씨는 어른들에게서 충무공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어왔다. 그런 그도 16년 만의 이장에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만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당시 명풍수 두사충이 잡은 자리에 안장된 것을 안 왕실에서 그 후손들의 명당발복을 두려워하여 알게 모르게 이장을 강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억측 가운데 하나다. 소문난 명당을 빼앗아 왕릉이나 태실(태실.왕실에서 태를 묻던 석실)로 활용함으로써 신하들의 명당발복을 견제했던 당시 왕실의 관행을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청와대는 원래 경복궁 후원이었다. 고건축 전문가 신영훈 선생의 말에 따르면 후원의 규모는 경복궁의 30분의 1 정도였다고 한다. 경복궁에 들어선 건물이 7000여 칸인 데 반해 후원 건물이 250칸 정도였음을 근거로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즉 과거 왕들이 거주했던 공간의 30분의 1 정도의 작은 공간에 현재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일제시대 총독 관저가 들어섰다. 문자 그대로 관저 규모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다.
문제는 경복궁 후원이 풍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머무는 터로서 좋은가 하는 점이다. 터의 좋고 나쁨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이다. 경복궁 터는 어떠했을까.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왕자의 난’으로 두 왕자를 잃는 등 불행한 일이 겹쳐 개성으로 환도하고 만다. 태종은 경복궁이 싫어 옆에 창덕궁을 짓게 하고 그곳에 주로 머문다. 세종은 성군의 정치를 펼쳤지만 개인적으로 불행의 연속이었다. 왕자들의 잇단 죽음과 왕비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질병 등으로 괴로워했다. 당시 풍수학자인 안효례와 승원로(承元老)는 왕이 거처하는 경복궁의 터가 불길해서 그러하니 개성이나 다른 궁으로 옮길 것을 주청한다. 10년 전인 서기 1433년(세종15년)에도 풍수학자인 최양선이 경복궁 터가 명당이 아니라는 상소를 올려 조정을 뒤집어놓은 적도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왕실이나 조정에서도 세종에게 잇따라 발생하는 불행이 ‘경복궁 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문종과 단종의 단명, 세조의 개인적 불운(의경 세자의 뜻밖의 죽음과 자신의 질병), 예종의 단명 등이 이어지자 왕들은 본능적으로 경복궁을 꺼려 다른 궁에 머물고자 했다.
임진왜란으로 불탄 궁들이 차례로 복원된 반면 경복궁만큼은 270년 동안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경복궁 중건이 이뤄지지 않은 까닭은 이곳이 불길한 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선 말엽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짓지만, 이로 인한 재정 낭비는 실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명성황후가 이곳에서 시해를 당했고, 조선은 곧 망했다.

경복궁 후원인 청와대 터는 어떠했을까. 일제시대 이곳에 관저를 짓고 살았던 일본인 총독들도 거의 불우하게 생을 마감했다. 일반인들이 이곳 터의 문제점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남산에 올라가보는 것이다. 남산 봉수대 부근에서 청와대를 바라보면 북악산이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거기다 북악산의 험석(險石)들이 눈알을 부라리고 있고, 서쪽에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우람한 인왕산이 위압적으로 서 있다. 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 자하문 방향에서 불어오는 살기 띤 바람을 옛사람은 황천살(黃泉煞)이라 하여 경계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없을까. 풍수적으로는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는 경복궁 말고도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 4개의 궁궐이 중건되었거나 복원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터는 창덕궁이다. 역사적으로 역대 임금들이 이곳에 즐겨 머물렀고, 전란이나 화재의 와중에도 조선 500년 내내 궁궐의 모습을 지켜온 곳이며, 1980년대 말까지 왕족이 거주했던 곳이다.

창덕궁 후원 쪽으로 가보면 북악산에서 팔각정 휴게소로 이어지는 뒷산 ‘북악 스카이웨이’가 마치 병풍을 둘러치듯 이곳을 감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산능선(龍)이 창덕궁까지 힘차고 위엄 있게 내려오면서 생기를 뿜어준다. 앞으로 바라보이는 남산도 다소곳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위엄을 갖추었으되 편안한 자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곳을 어떻게 대통령 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아름다움은 그저 바라보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긴하게 쓰일 때 값을 하는 것이다. 창덕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부분만 활용해도 충분하다. 경복궁 안에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는 것처럼 이곳 창덕궁을 대통령의 집무실로 활용한다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운 상승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창덕궁의 중심 건물인 ‘인정전’에서 국가의 큰 행사나 외국 사절들에 대한 접견이 이뤄지고, 후원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산책하면서 나랏일을 논의하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강원 춘천시에서의 풍수 기행은 대부분 춘천시 서면에 있는 신숭겸 장군 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려 태조 왕건이 양보한 명당이라는 전설이 내려와 신 장군 후손들뿐 아니라 풍수 호사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춘천이 자랑하는 명당은 바로 강원도청 터다. 춘천 시내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봉의산(301m)은 마치 삼태기를 엎어놓은 듯한 모양으로, 강원도청은 바로 그 삼태기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부드러움과 맑은 기운이 섞인 봉의산과 그 품안에 안긴 도청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한 지기(地氣)의 감응 탓에 다른 지역에서 ‘도지사나 광역시장의 비리 사건’이 불거져도 이곳 강원도만큼은 그런 일이 없다며 한 택시 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는 단순히 춘천 시민들의 괜한 자부심이 아니라 강원도청 터가 전국 도청(광역시청 포함) 가운데 최고의 명당임을 자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
원래 이곳은 ‘궁궐 터’였다. 1887년 조선시대 고종 임금 당시 난리 등으로 조정이 위험해질 때를 대비해 임금과 조정 대신들이 피할 궁궐을 지었는데 그 터가 바로 지금의 강원도청 자리다(그 후 궁궐은 화재로 불타 없어짐). 그만큼 당시 최고의 지관들이 동원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19세기 말 풍수에 의한 터 잡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봉의산에 자리한 도청 터 말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곳은 우두산(牛頭山)이다. 현재는 선산김씨 종산(宗山)이지만 조선시대 누각 조양루(朝陽樓)와 6·25전쟁(1950) 이후 지은 충혼탑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봐 산 자체가 명산임을 말해준다. 이곳 조양루 바로 옆에 이름 모를 무덤이 하나 있는데 ‘소슬묘’라고 한다. 사연은 이곳에 소를 놓아먹이던 시절, 소들이 봉분을 뿔로 들이받아 파헤쳐도 이튿날이 되면 절로 솟아나 ‘솟을뫼(소슬묘)’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름 없는 이 무덤이 ‘국제적인 전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중국과 관계된 얘기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관련 설이다.
우선 중국과 관계된 얘기는 이 무덤이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할아버지 무덤이라는 것. ‘주원장의 조부와 아버지가 유랑 끝에 조선 땅까지 흘러 들어왔으나 주원장의 할아버지는 곧바로 죽었고, 아버지는 이곳 우두산 아래에서 머슴을 살았다. 주인집에 찾아온 지관을 통해 이 자리가 명당임을 엿들은 주원장 아버지는 아버지 유골을 암장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훗날 머슴의 아들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명 태조 주원장이라는 것. 물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중국 정사(正史)를 보면 주원장의 조부 주초일(朱初一)과 아버지 주세진(朱世珍) 모두 유랑민에 가까운 신세는 맞으나 중국을 떠난 적이 없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청나라 황제의 조부 묘로 알려졌다.
일본 관련설은 가나자와 쇼사부로라는 역사학자가 일본어로 쓴 ‘春川風土記’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다.

‘이 무덤의 주인이 일본 왕자 숙슬(肅瑟)의 무덤, 청나라 황제의 조부 무덤, 말갈족의 무덤 등 소문이 무성한데, 그런 말들은 모두 거짓이며 여러 고문헌에 의하면 일본을 세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동생 ‘스사노 오노미코도(素盞鳴尊)’가 한반도의 ‘소시모리’에 건너갔다가 다시 출운국(出雲國)으로 귀환하였는데, 한반도의 ‘소시모리’는 다름 아닌 이곳 우두산 소슬묘다.’
그로 인해 실제 일본 총독 고이소와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 우두산 소슬묘를 신성시하고 이곳에 신궁을 건립할 생각까지 했다.
어쨌든 소슬묘에 얽힌 속설에는 병든 이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아들이 없는 이가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빈다. 필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도(2004년 11월) 봉분 이곳저곳에 타다 남은 향과 부적의 흔적이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타다 남은 향 가운데 일본제 향(향나무를 가늘게 깎아서 붉게 채색한 것)이 봉분 곳곳에 꽂혀 있었다는 점이다. 아직도 자기 조상의 유적지라고 생각하고 참배하는 일본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 훌륭한데 국회의원만 되면 하나같이 지탄을 받는다.’ ‘16대 국회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물갈이했더니 17대도 마찬가지다.’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하든 국회를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왜 국회의원만 되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는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땅이다. 여의도는 원래 모래섬(沙洲)으로 쓸모가 전혀 없는 땅이었다. 오죽하면 ‘너나 가져라(汝矣)’란 뜻의 여의도(汝矣島)란 지명을 갖게 됐을까.
여의도를 풍수적으로 살피는 데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여의도는 모래땅(沙土)이자, 한강의 흙을 퍼다 메운 사토(死土·죽은 땅)다. 생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기(氣)를 흩어지게 한다. 기를 분산시키는 땅은 방송과 금융업에 적절하다. 이에 대해서는 풍수학자 최창조(전 서울대)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이다. 몇 년 전 필자와 한 대담(월간 신동아 2000년 3월호)에서 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모래땅이라는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깥으로 분산되고 떨쳐버리는 성격이 있는데, 방송은 전파를 따라 외부로 발산하는 기운이고, 금융 역시 돈의 성격상 돌고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여의도의 지기(地氣)하고 맞아떨어지겠지요.”
모래땅은 콩가루와 같은 것이다. 쥐면 뭉치는 듯하지만, 놓으면 흩어진다.
둘째, 한강의 큰물 가운데에 있다는 점이 국회의사당 터로서 맞지 않다. 물가에는 놀러 가지 공부나 진지한 일을 논의하러 가지 않는다. 노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놀기 좋아하고 돈을 밝힌다면 그것은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한 땅의 성격은 연예인들에게 딱 맞다. 연예인은 자기의 ‘끼(氣)’를 맘껏 발산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고자 한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돈)로 본다. 물이 흘러오는 쪽을 향해 터가 들어서면 돈이 들어오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터를 잡으면 재물이 나간다는 풍수 속설도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다.
여의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람이 세다는 점이다. 풍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람이다. 한의학적으로 사람이 바람(風)을 맞으면(中) 중풍(中風)이라고 한다. 이는 치명적이다. 땅도 마찬가지다. 바람을 맞는 터 역시 중풍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시대 지관 선발시험인 ‘금낭경’은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진다(氣乘風則散)”고 했다. 쪼개지고 흩어지며 병이 들 땅이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물과 바람을 타는 이곳은 ‘방송·금융·연예가’의 땅에 어울린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는 옮겨야 마땅하다. 풍수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강 이북의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다. 역사적 의의가 있는 옛 건물로 공간이 좁을수록 좋다. 위압감 주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버리고 대중 교통을 이용해 등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을 만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문자 그대로 ‘사상누각’이다. 허풍만 들 뿐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다. 사방에 웅장한 산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을 찾아 뒤에 있는 높은 산을 보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되, 앞의 드넓은 들판을 보면서 스스로 호연지기(공명정대한 정신)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머지 하나는 국회를 없애는 방법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에서 근무하는 구자형 박사(46)는 대한민국 관료의 청렴도와 합리주의는 FBR 자체 평가로 세계적 수준이며, 바로 그 때문에 대한민국 재정구조가 견실하다고 필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그것이 국회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러나 이 방법은 ‘풍수적’인 측면에서만 하는 얘기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나 그의 세계관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남겨놓은 글이나 동시대인 혹은 제자들이 쓴 글을 읽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땅을 택하여 살았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는데, 풍수에서는 살았던 터를 통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본다면 이는 당연한 말이다. 인간과 대지는 혈연관계로 서로를 닮아가기 때문이다.
남명 조식 선생의 산천재와 무덤도 한 가지 좋은 예다. 남명의 터잡기(卜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성운이 지은 묘갈문(墓碣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묘갈문에 의하면 “남명은 61세 때 지리산에 산천재를 짓고 깊이 잠기어 스스로 닦으며 세월을 보내다가 72세에 운명하여, 산천재 뒷산에 안장되었다”(현재 행정구역명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고 적고 있다.
남명 선생이 터를 잡고 건 편액(扁額) ‘산천재’는 주역 대축괘(大畜卦)에서 유래한다. 대축이란 크게 저축한다는 뜻이다. 대축괘는 간괘(艮卦)와 건괘(乾卦)로 구성되는데 간괘가 산(山), 건괘가 천(天)을 나타내 ‘산천(山天)’이란 용어가 생겨난다. ‘山天’으로 꾸며지는 이미지는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
또한 주역에서 산은 ‘멈춘다(止)’, 천은 ‘창조적인 힘’이란 속성을 갖는다. 이 둘의 속성을 다시 합성해보면 ‘산속에서 창조적인 학문의 힘을 키운다’는 뜻이 된다. 산천재란 바로 그와 같은 집을 말한다.
산천재 뒷산에 안장되어 있는 남명의 무덤은 어떨까? 지리산 천왕봉의 한 줄기가 거침없이 곧장 내려와 산천재를 지척에 두고 멈춘 곳에 무덤이 자리한다. 곁가지 없이 산줄기 저 혼자 내려온다. 산능선이 높고 곁가지 하나 없는 만큼 무덤 좌우가 아찔할 만큼 깊어 보인다. 독야청청의 기세라고 할까, 소심한 현대인들은 결코 쓸 수 없는 자리다. ‘안으로는 하늘의 창조적 힘을 갈무리하고, 바깥으로는 산과도 같이 중후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남명의 무덤 터에서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명의 위대한 터잡기가 최근 들어 일부 몰지각한 풍수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풍수들이 검증·고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말하기 때문이다.
성현들의 묘나 유적지에 대한 풍수 해설이 쏟아져나오는데 상당 부분 고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더러는 성현들의 위대함을 훼손하는 ‘막말’에 가까운 것들도 있다. 풍수학을 하는 이로서 당혹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얼마 전 풍수 답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산천재의 의미와 남명의 터잡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학생 하나가 “남명 선생의 무덤은 명당이 아니라던데요?”라고 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 하는 필자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높아졌던지 움찔해진 학생이 “인터넷에 올려진 글을 보았는데 남명과 이황, 율곡의 묘는 묘도 아니라고 해서…”라며 말끝을 흐린다.
“그래서!”
“….”
“그분들은 성리학의 대가이지 풍수 전문가가 아니라고….”
더는 학생을 탓할 수도 없어서 목소리를 낮추어 마무리를 지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책임한 말들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풍수의 자연관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천박한 지식으로 무책임하게 지껄이는 시중 술사들의 잘못이 더 크다. 한 시대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의 터잡기를 일개 시중의 술사가 평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그 자리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산천재와 그의 무덤이 몇 백년이 가도 의연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으며, 남명의 위대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겠는가. 시중의 이른바 지관입네 하는 이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대부분 바로 그와 같은 짓 때문이다.
풍수란 땅을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곳에 터를 잡았던 옛 성현들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읽으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이 기마민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민족이 많다. 대표적인 민족으로 몽골족을 꼽지만, 우리나라도 고대 부여와 고구려가 기마민족이었으며 신라도 4∼6세기 6대에 걸친 ‘마립간’ 시대가 기마민족의 후예였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거쳐왔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기마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까닭은 말이 교통수단으로서 최고였을 뿐 아니라, 전쟁에서는 지금의 전투기를 뛰어넘는 전투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칭기즈칸의 원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교통수단이나 전투수단으로만 중요했던 것은 아니다. 농경사회에서 말은 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다. 과거 유럽의 부유한 농가에는 소와 말을 담당하는 머슴이 따로 있었는데, 말 담당 머슴의 서열이 더 높았다고 한다.
인간의 운명을 풀이하는 ‘사주팔자설’에는 ‘원진살’이란 것이 있다. 원진살은 서로를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살이다. 태어난 띠를 동물에 배속시켜 그 가운데 소띠와 말띠가 원진살이 들어 서로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한다(태어난 해뿐만 아니라 생월·생일·생시에도 적용된다).
십이지(十二支)는 각각 특정 동물을 상징한다. 십이지에 상응하는 동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子(쥐) 丑(소) 寅(호랑이) 卯(토끼) 辰(용) 巳(뱀) 午(말)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 (돼지).
열두 동물 가운데 힘과 고집이 가장 센 동물은 무엇일까. 답은 백수의 제왕 호랑이가 아니라 말이라고 한다. ‘말띠(午年生) 혹은 백말띠(庚午年生)생이 팔자가 세다’는 말은 이 속설에서 유래했다.
기마민족의 후예들과 농경사회에서 말이 대접받았던 것에 비하면 사주팔자설에서는 말띠가 ‘팔자 센’ 띠로 알려졌다. 말띠(특히 백말띠)인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민간 풍수에서도 말은 기운이 세 호랑이까지 제압하는 동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예가 경남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와 경남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에 있는 말 석상이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말 모양의 석상으로, 일종의 말 숭배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다.

말 석상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마을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었다. 마암면 석마리의 경우 “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말 석상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석상을 ‘마장군(馬將軍)’으로 부르며 마을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다. 석마의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명에까지 영향을 주어 부근에 ‘말바위’란 뜻의 ‘마암(馬岩)’면과 ‘석마(石馬)’라는 마을 이름을 만들어놓았다.
의령군 가례면에 있는 말 역시 “마을에 우환이 있어 말 석상을 세우고 정월에 제사를 지냈는데, 한때 이를 없애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해 그 후 다시 세웠다”고 한다.
두 마을의 공통점은 터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지점에 말 석상을 세운 일종의 ‘비보진압 풍수’다. ‘비보진압 풍수’는 터에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석탑·연못·제방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어 땅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 왕조에는 ‘산천비보도감’이란 관청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기도 했다.
원래 마암면 석마 마을에는 말 석상이 3개 있었다(가례면 대천리에는 1개가 있다). “3개 가운데 2개는 각각 암·수 말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좀더 작아 망아지를 상징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도둑이 망아지를 훔쳐가 현재는 두 마리 말이 망아지를 애타게 찾고 있다”(마을 사람들의 표현)고 한다.
오래된 나무, 석상 등에는 신기(神氣)가 서려 있다. 이를 사유화하는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는 반드시 불운한 일이 생긴다. 지금이라도 석마 마을의 망아지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린 말을 되찾는 기쁨을 주는 것이며, 훔쳐간 사람에게는 불운을 예방한다는 상생(相生)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 임실, 순창, 정읍 3개 군에 자리한 호남의 명산 회문산은 인근 사람들의 의지처이자 피난처였다. 이곳 사람들은 회문산이라 하지 않고 회미산이라 불렀는데, 가까이에 외갓집이 있었던 필자도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서 회미산이란 말을 가끔씩 들었다. 그것이 1950년 6·25전쟁의 생채기였음을 알게 된 것은 대학시절이었다.
그보다 50년 전인 대한제국 말에는 동학군과 항일의병이 이곳을 의지해 싸우거나 숨어들었다. 회문산은 이념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곳을 찾아드는 이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결코 살아서 나가게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음기가 강한 산의 성격 탓이었다.
비극의 현장으로서는 회문산보다 지리산이 더할 것이다. 그런데 지리산과 달리 이곳 회문산에는 풍수와 관련된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조선의 명당, 24개의 명당이 있는 곳,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의 명당(五仙圍碁穴)이 있어 발복이 되면 59대 후손까지 잘 살게 된다”는 등 회문산과 관련해 인근 마을 사람마다 다양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19세기 초 홍경래의 풍수 스승으로 알려진 일이승(一耳僧)이나 전라도의 전설적인 명풍수 홍성문(홍문대사 혹은 홍석문 등으로 불리기도 함)이 ‘회문산 명당도’를 남겼는데, 그 비결(秘訣)이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많다.
몇 년 전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히는 한 지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필자에게 ‘홍성문이 지은 회문산가 24혈’이란 비결을 보여주었다. 붓으로 쓰고 그린 고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모필한 최근 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24개 명당이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이 찾아서 광주와 전북 사람들에게 몇 곳을 소개한 적이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지만 회문산 능선을 오를 적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덤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계속 수요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잡초가 우거진 무덤들이 더 많다. 그래서 풍수 공부에 좋은 현장이 되는 곳이다.
회문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헬기장까지 개설된 비포장 임도(자동차 이용 가능)를 지나 회문산 정상(830m)으로 가는 능선에서 수많은 무덤들을 만나게 된다. 바위 위에다 관을 놓고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든 것, 바위 사이에 무덤을 쓴 것, 바둑판이라고 생각한 너럭바위 아래에 무덤을 쓴 것, 산 정상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무덤을 쓴 것 등 제각각 24명당 혹은 오선위기혈임을 확신하고 쓴 무덤들이다(사진 참고). 너무 많은 무덤이 들어서 골칫거리가 되자 최근 산림청에서는 ‘무연고 무덤 정리’를 공지할 정도가 되었다.

풍수 정설에 따르면 “명산(名山)에 명당 없고, 고산(高山)에 명당 없으며, 악산(惡山)에 명당 없다”고 했다. 회문산은 명산이자 고산이며 악산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설일 뿐 예외가 많다. 여러 가지 괴혈(怪穴)들은 명산이나 악산에도 많다. 이곳의 무덤들은 모두 괴혈임은 확신하고 쓰여진 자리다. 괴혈의 전시장인 셈이다.
회문산은 잠시 머물다 갈 자리이지 영주할 곳이 아니다. 음기가 강한 까닭에서이다. 음기의 정수를 표출하듯 헬기장에서 정상으로 10분 정도 오르다 보면 등산로 한가운데에 소나무(赤松)가 서 있다. 동양 최고의 여근목(女根木)이다. 필자의 주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웃 나라 여근목이란 여근목은 모두 찾아다닌 어느 분의 말씀이다.
그분 말씀으로는 일본에 이것이 소개되면 단체 관광객이 몰려들 곳이라고 극찬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필자에게 이 여근목은 회문산 음기의 상징으로 보였다.

1836년 김대건이 15세의 나이에
신학 공부를 위해 중국 마카오로 떠날 때 동생 김란식은 겨우 아홉 살이었다. 란식은 12세 때 아버지 김제준이 순교 하자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신부가 되어 돌아올 형을 기다린다. 형과 헤어진 지 10년 만인 1845년 애타게 기다리던 형이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한다.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인가. 그러나 만남은 너무 짧았다. 형제는 1845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경기도 용인 ‘은이공소’에서 만난 게 전부였다. 이듬해 형 김대건 신부가 관헌에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효수되었기 때문이다. 형의 순교 후 김란식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어머니와 함께 걸인처럼 살았다.
그러나 잠시 즐거움도 있었다. 신심 깊고 착한 안동 김씨 처녀와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세 식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고, 1864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오갈 데 없는 그에게 1866년 병인박해로 참혹한 시련이 또 닥쳐왔다. 그는 비교적 박해가 덜한 전라도로 내려왔다. 먼저 이곳으로 내려온 7촌 조카인 김현채 가족 및 다른 신자들과 함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먹구니란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회문산 깊은 골짜기로 초근목피 말고는 먹을 것이 없었다. 땅을 개간하고 조를 심었지만 굶주림을 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몇몇 신자가 굶어죽기도 했다. 김란식은 토종벌을 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나중에 솜씨가 늘어 50통에 이르렀다. 그는 처자식 없이 수도자처럼 홀로 살다가 1873년에 세상을 떠났고, 먹구니마을에서 회문산 정상 쪽으로 1km쯤 떨어진 양지바른 언덕에 묻혔다.
올 2월14일, 눈에 발목이 푹푹 빠지는 이곳을 답사했다. 신태인성당의 김봉술 신부님과 박찬주 사목회장이 동행해주셨기에 찾을 수 있었지, 물어서는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눈이 쌓였는데도 김란식과 7촌 조카가 묻힌 무덤만큼은 편안해 보였다. 회문산의 험한 산세가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또 후손이 없는 묘지치고는 관리가 아주 잘돼 있었다. 근처 가리점마을 신자들이 관리를 해온 까닭이다.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가리점마을로 이사 온 정행례(70세) 할머니에 따르면 이미 당시에도 김란식의 무덤을 신자들이 돌보았다고 한다.

흔히 좋은 명당으로 십승지(十勝地)가 언급되곤 한다. 그런데 이를 잘못 이해하여 이 땅에 가서 살면 크게 잘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십승지란 조선 후기에 지어진 비결서 ‘정감록’에 나오는 용어로 ‘난세에 지도자가 사라져 더는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 있는 사람은 살고 지각 없는 사람은 죽을’ 시기에 부닥칠 때 피난해야 할 열 군데를 말한다. 따라서 ‘십승지’는 명당발복을 기대할 땅이 아니라 난세의 피난처(保身之地)를 말한다. 김대건 신부 동생 김란식이 박해를 피해 숨어든 정읍 산내면 먹구니마을 역시 십승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가 살았던 먹구니마을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잡목에 묻혀 있다. 고목이 된 감나무들만이 그곳이 한때 마을 터였음을 말한다.

현재 신태인성당과 정읍시에서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다 간 이들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이곳에 기념관 건립을 모색한다고 한다. 풍수에 ‘무자손천년향화지지(無子孫千年香火之地)’란 말이 있다. 자손이 없는데도 좋은 자리에 안장됨으로써 후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무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묵대사 어머니 무덤(전북 만경읍 화포리 소재)으로 지금도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
부디 이곳에 김란식과 이름 없이 살다간 신자들을 위한 기념관(기념비)이 세워져 ‘무자손천년향화지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벌명당과 생태계 파괴

전남 나주시 왕곡면과 공산면을 잇는 23번 국도 중간 지점에서 반남면 면소재지로 이어지는 작은 지방도로가 있다. 이곳을 따라가면 ‘반남 고분군(古墳群)’ 표지와 함께 거대한 무덤들을 볼 수 있고, 다시 몇 백 미터를 가다 보면 작은 고개가 나온다. 이곳이 ‘벌고개(蜂峴)’인데 고갯마루 한쪽에 ‘蜂峴’이라고 새겨진 바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봉현’ 표석은 어느 이름 모를 지관을 위해 반남 박씨 문중에서 세워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때는 고려 왕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곳 반남면 일대의 호족이었던 박응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의가 인근 지관에게 묏자리 소점(터 잡는 일)을 부탁했다. 지관이 묏자리를 잡아주긴 했는데 어쩐지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 지관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의는 한밤중에 지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관 부부의 대화를 엿듣는다.
“박 호장님(박응주) 댁 묏자리를 잡아주셨어요?”
“잡아주기는 했는데, 사실 그 자리보다는 큰 버드나무 아래가 더 좋아.”
“그러면 왜 그 자리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 자리로 잡으면 내게 큰 화가 닥쳐서….”
이 말을 들은 박의는 다음날 지관이 말한 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지관이 새파랗게 질려 빌면서 말했다.
“제발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묏자리 파는 것을 늦춰주십시오.”
지관의 부탁을 듣고 잠시 기다렸던 의는 지관이 자기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될 즈음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땅속에서 큰 벌들이 나와 고개 쪽으로 날아갔다. 벌들은 고갯마루를 넘어가던 지관을 쏘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박응주의 무덤을 ‘벌명당’, 지관이 숨진 고개를 ‘벌고개’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 ‘蜂峴’이라 새긴 표석을 세워놓았다.
이후 반남 박씨는 벌명당의 발복 덕분에 후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높은 벼슬은 말할 것도 없고 큰 학자도 부지기수로 배출했다. 박세채, 박세당, 박지원 등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자들뿐 아니라 대한제국 정치인 박규수에서 최근 철학계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찬국(서울대 철학과)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벌명당의 후손들이다.
물론 벌명당의 전설은 반남 박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 사당동 동래 정씨, 전북 완주 산정마을 진주 소씨 선영도 이와 비슷한 벌명당 전설을 가지고 있다.
‘벌명당’이란 뒷산(주산)의 우뚝 솟은 봉우리가 멍덕(재래식 벌통 위를 덮는 뚜껑. 짚으로 틀어서 바가지 형태로 만듦) 모양이면서 주변 형세가 꽃의 이미지를 띤 것을 말하는데, 이곳에 무덤을 쓰면 벌떼처럼 자손이 번창하고, 또 그 벌떼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으듯 재물과 명예가 엄청나게 쌓이는 소응(昭應·감응이 또렷이 드러남)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현대 생태사상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벌명당을 잡아준 지관의 죽음이다. 반남 박씨뿐만 아니라 진주 소씨, 동래 정씨를 위해 벌명당을 소점해준 지관은 모두 벌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으로 나온다.
만물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집이 있다. 인간만 좋은 집터를 가지란 법은 없다. 동식물도 각기 천혜의 명당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관이 그러한 동식물의 집터를 빼앗아 인간이 차지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생태계 파괴자’가 된 셈이다. 집을 빼앗긴 벌들이 ‘생태계의 파괴자’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이 벌명당 전설에 깃든 교훈이다.
조선조 최고 풍수사들 사이에 ‘지관(풍수)을 3대 하면 절손(絶孫)한다’는 말이 있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라고 여겨진다.

경희대가 자리한 서울 동대문 회기동이란 지명과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는 깊은 인연이 있다. 사연은 성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481년 과거에 합격해 대구부사 등을 거쳐 정삼품에 오른 유학자 관리로, 오히려 풍수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 최호원이 어느 날 성종에게 불려간다. 성종은 “주변 사람들이 풍수가 망령된 술수라며 비난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묻는다. 이에 최호원이 “풍수설이 망령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그들의 부모를 장사 지낼 때는 풍수를 본다”라고 답하며 풍수를 적극 옹호한다. 성종은 최호원을 풍수전문가로서 매우 신뢰했는데, 성종뿐만 아니라 이전 임금들도 각자 신뢰하는 풍수전문가를 한두 사람씩 두었다. 태조는 무학에게, 태종은 하륜에게, 세종은 이양달 등에게 의지했다. 최호원의 풍수 실력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만 보더라도 당대 최고였다. 그러나 최호원을 신하로 둔 성종은 풍수와 관련,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역사에 의한 평가이긴 하지만, 성종의 가장 큰 불행은 ‘폐비 윤씨’ 사건과 그로 인한 아들 연산군의 폐륜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풍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1488년(성종 19년) 당상관 김석산이 올린 한 장의 상소가 조정을 발칵 뒤집는다.
“신이 삼가 풍수서 가운데 당나라 일행 선사가 쓴 ‘38장법’을 살펴보니, 폐비 묘가 건좌손향으로 오(午)방이 수파이며, 오방과 미(未)방의 사이가 정(丁)방으로 장남이 되는데, 정방 땅의 반(半)이 오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장생(長生)방이 오방 땅을 범하지 않았는가 의심되므로 감히 이를 아룁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일 같으나 김석산이 언급한 폐비 묘는 바로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묘였다. 윤씨는 투기가 심해 성종을 난처하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1479년에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면서 폐비가 되고 3년 뒤 사약을 받고 죽는다. 사약을 내린 뒤 성종은 묘비도 세워주지 않으려 했으나 세자의 앞날을 생각해 ‘윤씨지묘’라는 묘비명과 함께 성종 자신이 죽은 뒤 100년까지는 폐비 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하라는 엄명을 내린다. 그런데 김석산이 어명을 어기고 상소를 올렸으니 성종은 노발대발했고, 대신들은 벌벌 떨면서 성종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석산을 의금부에 넘긴 성종은 한편으론 폐비 윤씨 묘가 ‘흉지’라는 말에 불안해한다. 윤씨 때문이 아니라 윤씨가 낳은 세자(훗날 연산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였다.

최호원, 서거정 등 당시 풍수에 조예가 있는 대신들을 부른 성종은 폐비 묘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한다. 이에 대해 최호원이 “비록 김석산의 이론이 근거가 없긴 하나, 실제로 폐비 윤씨 무덤 터가 보통 사람이 쓴다면 몰라도 나라에서 쓰기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라는 보고를 올린다. 보고를 받은 성종은 이장을 지시한다. 그러나 대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장을 논의하자, 무슨 까닭에서인지 성종이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윤씨 묘 이장은 진행되지 않는다.
훗날 김석산과 최호원이 예언한 대로 끔찍한 사건이 연산군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성종이 죽은 뒤다.
문제가 된 폐비 윤씨의 무덤 터는 지금의 경희의료원과 경희여중고 일대다. 그러면 회기동이란 지명과 폐비 윤씨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폐비 윤씨가 묻히고 난 뒤 이 일대는 ‘회묘(懷墓)’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릉으로 승격, ‘회릉(懷陵)’으로 바뀌었다가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다시 ‘회묘’로 돌아온다. 그렇게 몇 백 년이 흐른 20세기 초 ‘회묘’란 지명이 좋지 않다고 하여 회묘 대신 회기(回基)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67년 윤씨 무덤이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지면서 회기동과 폐비 윤씨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난다.

풍수에서 땅을 보는 방법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다. 먼저 특정한 지점의 산과 물을 세분하여 미시적으로 알아본 다음, 해당 부분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거시적으로 살핀다. 대개는 미시적으로 판단한 것과 거시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일치한다. 즉 미시적으로 살펴 좋은 땅은 거시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땅을 살피는 것을 물형(物形)론, 또는 형국론이라고 한다. 물형론은 대개 특정 동식물이나 사람의 모양에 빗대어서 땅의 기운을 설명한다. 물형론이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땅에 대한 인간의 미학적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미(審美)의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땅의 특성을 파악, 적절한 쓰임을 찾아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론을 제시한다. 땅에 대한 학대가 심한 요즘, 물형론적 사유방식이 더욱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백전(잣밭) 마을. 앞산에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 장군(1554~92)의 어머니 창평 이씨 무덤이 있다. 이 무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설이 있다고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 이영림 감사는 전한다.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渴馬飮水形)이 그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명나라 명풍수 두사충(杜師忠, 주간동아 382호에 소개)에게 부탁하여 잡은 자리라고 한다.
이 두 전설을 가지고 이곳 터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 또는 추론할 수 있다. 먼저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은 산세가 말처럼 힘 있고 규모가 커야 한다. 목마른 말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샘(泉)이나 연못(池), 호수(湖), 내(川)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장군 어머니 무덤 바로 앞으로 ‘산방천’ 물이 흘러 들어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킨다. 또 목마른 말의 경우 신경이 모두 머리에 쏠려 있기 때문에 무덤을 말머리 부분에 써야 하는데, 김 장군 어머니 무덤은 말머리를 연상시키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마셔야지 나가는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무덤이 물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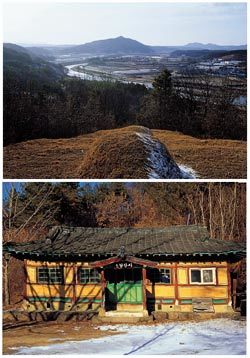
또 동물에 빗대어 땅을 표현한 곳에는 돌을 올려놓으면 그 짐승이 힘을 쓸 수 없다고 해서 비석이나 상석 등 석물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 이곳 김 장군 어머니 무덤에도 그러한 까닭에 일체의 석물을 올리지 않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이 무덤을 임진왜란 때 귀화한 명풍수 두사충에게 은(銀) 서 말을 주고 잡게 했다는 전설에서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김 장군이 두사충에게 부탁하여 잡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으나, 앞뒤 정황을 보면 동생 김시진(1564~1632)이 주도한 듯하다.
두사충은 임진왜란이 나자 이여송 군대를 따라 1592년 12월 평양에 머문다. 그런데 이때는 김 장군이 이미 전사(1592년 10월)한 뒤이므로 김 장군과 두사충의 만남이 불가능하고, 또 김 장군의 어머니 창평 이씨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594년에 죽었다. 게다가 김시진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무덤 입구에 ‘도정강사(桃汀講舍)’를 짓고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도정강사’의 건축 양식은 중국식이다.
이로 보아 두사충에게 묘지 소점을 받으면서 정사 터와 공간배치까지 조언받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두사충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아산에 와서 이순신 장군의 무덤(옛 무덤 터)을 잡아준 기록이 있어 그 즈음에 이곳에 들렀는지, 그 이전에 들렀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터를 소점받기 위해 두사충에게 지불한 은이 서 말이다. 보통 지관에 대한 보수는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정중하게 하고, 예물은 후하게 한다(卑辭重幣)’가 지관에게도 적용되는데, ‘쌀 서 말에 두루마기 한 벌’이면 비교적 점잖은 사례였다. 은 서 말이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중국의 명풍수라고 알려진 두사충이었던 만큼 지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수로 추정된다.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千年鶴)’은 소설가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선학동 나그네’는 임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크게 성공시킨 ‘서편제’의 연작소설이다. 때문에 ‘천년학’과 ‘서편제’는 등장인물이 같고 내용도 비슷하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선학동 나그네’가 풍수를 주 소재로 하는 ‘풍수소설’이라는 점이다.
‘선학동 나그네’는 전남 장흥 ‘회진(會鎭)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회진 땅에 도착한 한 낯선 사내가 버스 종점에서 10리는 족히 되는 선학동으로 향한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선학동 주막에서 낯선 사내와 주막집 주인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선학동’이라는 마을 이름은 포구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 뒷산인 ‘관음봉’(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뒷산, 실제 산 이름은 ‘공지산’)의 모습에서 연유한다. 달이 뜨고 마을 앞 포구에 물이 차 오르면 관음봉 그림자는 영락없이 날아오르는 한 마리 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마을은 바로 그 학의 품에 안기는 형국이 된다. 그래서 선학동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관음봉 어디쯤에 북소리가 울리는 명당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어느 해 가을 남도 소리꾼 부녀(실은 사내아이를 포함해 셋이다)가 선학동으로 찾아든다. 늙은 아비와 이제 열 살쯤 돼 보이는 눈먼 딸이었다. 포구에 물이 차 오르고 선학동 뒷산 관음봉이 물을 박차며 한 마리 비상하는 학의 모습을 띨 때, 노인은 어린 딸에게 소리를 가르친다. 그리하여 “부녀가 날아오르는 학과 함께 소리를 시작하면, 선학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학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 된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 좌향(坐向) 속에서(풍수가 중시하는 요소들이다) 눈먼 딸에게 소리를 가르쳐온 노인은 자신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생각하자 홀연 주막을 떠나 자취를 감춘다.
딸의 득음(得音) 과정이 풍수지리를 매개로 하여 묘사되는데, 아비는 딸에게 보이지 않는 ‘눈’ 대신 물 위로 날아오르는 학을 ‘온몸으로 보게 함’으로써 ‘개안(開眼)’시켜 준다. 풍수사들이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개안의 단계다.

그들이 떠난 뒤 포구는 물길이 막혀 들판으로 바뀌고, 물을 잃은 관음봉은 더 이상 학으로 날아오를 수 없게 된다. 관음봉은 날개가 꺾여 주저앉은 새이자 꿈을 잃은 산이 되어버렸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장성한 눈먼 딸이 다시 이곳을 찾는다. 관음봉 어느 골짜기에 있다는 명당에 아버지 유골을 모시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암장을 하지 않고서는 무덤을 쓸 수 없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네 산을 단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소리를 시작한다.
노랫소리는 주막 일대의 어둠을 흔들고, 사람들의 애간장을 끓게 한다. 그녀의 소리가 비상하는 학을 불러내는 것인지, 그 자신이 노랫가락 속에서 한 마리 학이 되어가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에 홀려 더는 어쩌지 못하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관음봉 자락에 아버지 유골을 은밀히 안장하고 떠난다. 이와 함께 비상하는 학을 마을 사람들 가슴에 남겨두고 간다.
작품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내는 30년 전 의붓아비와 딸이 소리를 할 때 장단을 쳐주던 눈먼 딸의 오라버니였다. 오라버니는 아비와 누이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회한에 찬 심정으로 옛날 그 주막집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날 밤 의붓아비와 학의 넋이 되어버린 누이의 이야기를 주막 주인에게서 들은 낯선 사내는 이튿날 아침 그곳을 떠난다. 그러나 금방 떠나지 못하고 고개 모퉁이에 오랫동안 앉았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모습을 감춘다. 빈 하늘에 날개를 펴고 하염없이 날아오르는 흰 학 마리를 만들어놓은 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해진 대신, 충남 연기군 남면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이곳 시골 들판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관여하기도 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풍수는 참고사항 정도에 그쳤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풍수학이 도읍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중심 구실을 했지만, 이번 입지 결정에서는 서구식 방법론으로 무장한 건축, 도시, 토목학, 조경학 교수들이 후보지 평가를 주도했다(이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사전에 현장을 가보았는지 궁금하다).
전통 터 잡기 방식인 풍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에 기여하지 못한 것에는 풍수학계의 잘못도 많다. 광복 이후 풍수학은 콘텐츠 개발을 등한히 해 행정수도 입지 선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1960년대 풍수학 재건의 기초를 놓은 고(故) 배종호(연세대 철학과) 교수 이후 80년대 풍수학의 부흥에 결정적 기여를 한 최창조(전 서울대 교수) 씨가 한 월간지에 ‘신행정수도 반대’ 글을 기고하면서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풍수는 이래저래 비웃음만 사는 꼴이 되었다. 사실 최 씨의 신행정수도 반대는 ‘풍수평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관에 따른 ‘시사평론’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서구식 토목, 건축, 조경학이 주류를 이루는 도시 건설에 왜 풍수가 배제되었을까. 서구식 토목건축학의 뿌리가 된 ‘히포크라테스 학파’ 후예들의 도시 건설론을 들여다보면 동아시아의 풍수보다 더 ‘풍수적’임을 알수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저서로 알려진 ‘공기, 물, 장소’는 ‘도시의 방위와 사람의 체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뒤 “인간이 거주하는 곳의 기후와 땅이 인간의 물리적, 도덕적 성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 플라톤은 “도시의 터를 잡는 입법자들뿐만 아니라 도시를 건설하는 건축가들도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간에게 좋거나 나쁜 성격을 형성하게 해주고, 어떤 지역은 수질이, 또 어떤 지역은 그 땅에서 자라는 생물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영양을 줄 수도,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도 “건축가는 그 지역의 토양과 대기의 특성, 지역 특성, 그리고 물의 공급 등과 관련된 의술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상은 18세기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주어 “기후는 특정 지역 사람들의 신체적, 도덕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서흥관 교수 옮김, ‘히포크라테스’ 참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인 연기군 남면 일대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청룡백호 등 기본적으로 풍수 요건을 갖춘 곳이다. 물론 많은 풍수 술사들은 이곳 터에 대해 그리 호평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애당초 완벽한 땅이란 없다. 오죽하면 16세기 중엽에 중국 풍수를 집대성한 ‘인자수지(人子須知)’는 “아무리 좋은 땅도 완벽하지는 않다(好地無全美)”고 했겠는가.
부족한 점은 적절한 공간배치 등의 비보진압(裨補鎭壓) 풍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풍수 논리다.
먼저 중심 건물과 간선도로의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주변 건물들과 지선도로들이 정해질 것이다. 중심 건물은 주산(연기군 남면 진의리 원수산)에 의지하고 장남평야 밖으로 흐르는 금강을 바로 보게, 즉 배산임수로 하면 된다. 주산(250m)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건물들도 높지 않아야 함은 기본이다. 그리고 그밖의 건물들은 중심 건물 주변으로 배치하되, 이곳의 경우 주산에서 금강까지의 거리(약 2.3km)보다 청룡백호 사이의 거리(약 2.6km)가 더 긴 만큼 도시 구조가 가로보다는 세로로 형성되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만약 그러고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비보진압 풍수를 시행한다. 비보진압 풍수란 부족하거나 지나친 것을 보충하거나 눌러주는 풍수 행위로서 연못 파기, 나무 심기, 물길 돌리기, 다리 놓기 등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일종의 도시 조경 혹은 국역(國域) 조경이 그것이다. 그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행정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가을 황금물결로 넘실대던 이곳 장남평야가 10여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우리풍수|여주 세종대왕릉

조선시대 왕릉은 대부분 도성(한양) 100리 안에 있었다. 당시 왕의 하루 행차 최대 거리가 100리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새로운 장지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무덤 가운데 좋은 자리를 찾아서 ‘재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때 도성 100리 안에 있는 무덤으로서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하고 장수하는 집안이 1차 심사 대상이었다.
그런데 세종대왕릉인 영릉은 도성에서 100리 이상 떨어진 경기도 여주에 위치해 있다

세종은 생전에 풍수를 신봉 “풍수지리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아들 수양대군(훗날 세조)에게 풍수를 배우게 할 정도였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 역시 풍수를 신봉했다. 그런데 아들 의경세자가 스무 살에 갑자기 죽고 자신도 고질병에 시달리는 등 왕실에 불행한 일이 잇따르자, 조정에서는 헌릉(태종릉) 옆에 있던 부왕 세종대왕의 무덤(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부근)이 좋지 않다는 등의 논란이 벌어진다[훗날 이장을 하려고 광중(壙中)을 열어보니 실제 안 좋은 상태였다]. 세조도 천묘(遷墓)를 염두에 두었지만, 일부 대신이 반대를 하고 마땅한 묏자리를 찾지 못해 고심하던 중 죽고 만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지관 안효례를 중용한다. “특별히 풍수학인 안효례와 최호원을 중용하라”는 세조의 유명에 따른 것이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안효례를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세조의 능 선정뿐 아니라 세종의 이장 후보지를 찾게 한다.
안효례는 풍수는 물론이고 주역에도 일가견이 있어 정인지, 정창손, 신숙주 같은 당대의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등 세조에게서 인정을 받았던 풍수학인이었다.
안효례는 세종릉 후보지로 여주의 어느 무덤을 추천했다. 본래 이 자리에는 대제학 이계전과 우의정 이인손 부자의 묘가 있었다. 이계전은 고려 말 이색의 손자로서 명문가를 이루고 있었기에 그의 무덤터는 왕릉 후보지로서 더할 나위가 없었던 것이다.
후보지를 찾는 일에 동행했던 대신들 가운데 정인지 등이 안효례의 풍수 실력에 의문을 제기, 벌줄 것을 효종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효종은 안효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세종의 무덤을 현재의 자리로 옮기게 한다. 문제가 된 것이 도성 100리 밖에 위치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한양에서 이곳 여주까지 배로 하루에 오갈 수 있다는 논리로 넘어간다. 훗날 효종 무덤이 동구릉(경기도 구리시 소재)에서 영릉 근처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선례 때문이었다.
예종은 할아버지 세종의 무덤을 여주로 옮기게 한 뒤, 이인손의 장남 이극배를 정이품으로 승진시켜 조상 묘지를 넘겨준 데 대한 보상을 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또 다른 운명 탓인지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만다. 당시 나이 스물이었다. 우연하게도 요절한 형 의경세자와 같은 나이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벌을 그가 받은 것이라고 했다. 짧은 재위기간 때문에 예종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돌아가신 부왕의 능을 조성하고 이미 부왕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세종의 능을 옮기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해서 생긴 여주 영릉에 대해서는 풍수사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개는 ‘조선 왕릉 가운데 최고의 명당으로서 바로 그 자리 때문에 조선 왕조가 100년은 더 연장되었다(英陵加百年)’는 찬사를 했으나, ‘주산에서 혈장에 이르는 산능선이 일직선으로 힘없이 내려와 기가 생동하지 못하고 청룡 끝(현재 기념관 자리)이 배반함으로써 수구를 벌어지게 했으며, 그 결과 기가 모이지 않는다’고 흠잡은 이들도 있었다.
어쨌든 여주 영릉은 당시 최고의 풍수학인 안효례가 잡은 자리지만, 예종이 스무 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 왕실의 불행을 막지는 못했다.

1969년 7월.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대표가 만난 자리에 파주군수와 파주경찰서장 등이 입회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화해증서가 작성된다.
“파주군 광탄면 분수리에 소재한 파평 윤씨의 선조 문숙공 분묘에 청송 심씨의 선조 만사 상공 분묘가 압뇌(壓腦)돼 있어 윤·심 두 성 사이의 송사가 수백년에 걸쳐 계속돼왔는데, 두 성 사이의 세혐(두 집안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미움과 원한)으로 인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양가의 대표가 이 증서를 작성,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윤학준의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에서 재인용함).
문숙공과 만사는 누구인가. 문숙공은 저 유명한 고려의 명장 윤관(1040~1111년)으로 문하시중을 지냈고, 만사는 심지원(1593∼1662)으로 효종 임금 당시 영의정을 지낸 청송 심씨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생존 연대가 500년 넘게 차이 나는데 후손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계기는 윤관 장군과 영의정 심지원의 무덤이 같은 산줄기에 몇 m를 사이에 두고 있게 된 데 있다.
1111년 윤관 장군이 죽자 ‘파평현 분수원 북간원(北艮原)’에 안장되어 조선 초기까지는 묘지가 잘 관리되었다. 그런데 중기에 들어서 금산(禁山)제도가 도성 100리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이곳을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그 후 거듭된 전란으로 윤관 장군의 묘가 실전(失傳)돼버린 것이다.
윤관은 여진족을 소탕하고 국경을 확장한 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풍수에서도 당대 최고였다. 그의 대표적 업적은 바로 현재의 경복궁 터를 도읍지가 될 만한 땅으로 소점한 것이다. 1101년 9월 남경을 설치할 터를 물색하라는 고려 숙종의 명을 받은 윤관은 한양 일대를 살핀 뒤 다음과 같은 계를 올린다.
“양주군 노원역과 해촌, 용산 등 여러 곳에 나가 산세를 살폈으나 도성으로 적당하지 아니하고, 삼각산 면악(북악) 남쪽을 보니 산 모양과 수세가 옛 문헌과 부합됩니다. 주산 줄기에 중심을 정하고 큰 맥에 임좌병향(壬坐丙向·남향)이 되도록 지형에 따라 도성을 건설할 것을 주청드립니다.”
숙종은 윤관 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로 하여금 5년에 걸친 도성 축조를 지휘하게 한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기 300년 전의 일이다. 지금 서울의 밑그림과 기초는 윤관 장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풍수의 대가인 윤관이 자신의 무덤 터로 정한 곳이라면 당연히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윤관 장군 묘 바로 몇 m 위에 있는 영의정 심지원의 무덤 자리는 또 어떨까. 심지원은 조선 효종 임금 때 영의정에 올랐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심익현이 효종의 딸 숙명 공주와 결혼해 효종과는 사돈관계였다. 효종이 죽자 심지원이 총호사의 직책으로 국상을 주관하면서, 효종의 능 자리 선정에 고산 윤선도를 추천할 정도로 풍수에 탁월한 식견을 가졌다. 고산 윤선도는 훗날 정조 임금에게서 신안의 경지에 오른 인물이라는 칭찬을 받은 최고의 풍수 고수였다. 그런데 그러한 심지원이 자기 조부모와 자신의 무덤 자리를 윤관 장군 무덤 바로 위에 잡은 것이다. 윤관과 심지원 모두 이 땅이 명당임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심지원이 이곳에 안장된 지 90년쯤 후, 윤관 장군의 후손이 실전된 조상의 무덤을 찾아다니던 끝에 드디어 그 자리를 찾아낸다. 그때부터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문중은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며 다투기 시작했다. 영조 임금이 분쟁 조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일제강점기까지 두 집안의 분쟁은 계속되었으며 두 문중 간의 감정의 골 역시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러니 상대 문중과 결혼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69년에야 분쟁은 윤관 장군과 영의정 심지원의 무덤 사이에 곡장(曲墻)을 두르고 화해증서를 쓰는 것으로 종식된다. 그야말로 200년 만의 화해였다.
이곳을 답사하다가 만난 윤여순(서울 용산구 거주·72) 씨에게 “지금도 두 문중 간에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서로 좋아서 하는 것을 누가 말립니까!” 하고 웃는다.

“근래에 쓸모없는 늙은 농사꾼 되어
시냇물 흐르는 산간에서 헛되이 늙어갑니다.
가뜩이나 병든 몸, 수심도 가득한데
가을바람에 날리는 서릿발 수염, 차마 볼 수 없군요.”
조선 명종 때의 명풍수 남사고(南師古, 1509~71)가 남긴 시 한 편이다. 천문과 지리에 능통해 문정왕후의 죽음, 남명 조식의 죽음, 선조 임금 즉위, 임진왜란 발발 등을 예언했다는 남사고의 시치고는 너무 쓸쓸하다.
그가 당시 여러 사건을 예언한 것은 율곡 이이나 상촌 신흠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19세기 초 승려 출신 풍수 일이승은 “불교계를 제외하고 유교계의 풍수 가운데 탁월한 사람은 오로지 남사고뿐이다”고 평했으니, 비범한 풍수가였음이 확실하다.

남사고의 삶은 어떠했을까. 대체로 당대 최고의 풍수 실력을 인정받으면 왕실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대부들의 후원을 받아 살림살이가 비교적 넉넉했다. 그러나 그는 곤궁한 삶을 살았다. 자신의 시에 나타난 것처럼 병든 몸에 죽음을 걱정하고, 추운 날씨에 옷이 없어 친구 조문조차 못 갈 정도였다. 이러한 형편은 그가 친구 최향호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
남사고는 명종 때 잠깐 사직참봉을 했고, 울진군 근남면 구산 4리 내성산동 마을로 이사하여 말년을 보내다가 선조 임금 초(1569년) 천문 교수로 특채되어 다시 벼슬로 나아갔다. 천문 교수 임기가 끝나갈 무렵 태사성(별)이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나이 든 상관이 자기 명이 다한 것으로 짐작하고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자, 남사고가 웃으면서 “죽을 사람이 따로 있다”고 했다. 얼마 후 남사고 자신이 죽었는데 당시 그의 나이 63세였다(1571년). 서울의 친구들이 돈을 걷어 울진까지 운구, 집 옆에 안장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남사고의 무덤은 바로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남사고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설들이 전해지지만 대개는 사실과 다른 것들이다. 아버지 무덤을 아홉 차례 이장했다는 구천십장(九遷十葬) 전설, 예언서 ‘격암유록’ ‘격암비록’ ‘마상록’ 등을 남겼다는 이야기, 그 자신이 절손될 터로 아버지 무덤을 이장했고 자신도 절손할 터에 묻힌 까닭에 절손이 되었다는 등 다양하다.
그만큼 유명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가탁(假託)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아버지 무덤을 두 번밖에 이장하지 않았다(현재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한티 소재). 그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격암유록’ 등은 대한제국 말의 사이비 종교가나 술사들이 그의 이름에 가탁한 것이다. 그의 저서는 화재로 인해 시와 편지 몇 편만이 전해올 뿐이다. 그는 아들과 딸을 두었으나 아들이 일찍 죽어 사실상 절손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신과 관련, 천하의 명풍수 남사고의 풍수 실력은 어디서 드러난 것일까. 그가 말년에 이사를 와 살았던 내성산동 마을 터와 그의 무덤 터일 것이다. 마을 자체는 앞산이 왼쪽으로 한 바퀴 빙 돌아서[풍수 용어로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이라 한다] 만들어놓은 작은 분지에 있어 난리를 피하기 좋은 땅이다. 또 웅장한 앞산이 그의 무덤을 내려다보는데, 전혀 위압적이지 않고 마치 고관대작이나 웃어른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배나 아랫사람을 편안하게 보살펴주는 형상이다.
비록 후손은 없지만 언제까지나 숱한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또 그의 풍수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무덤과 집터뿐만 아니라 아버지 무덤까지 찾아오게 하는 매력도 아마 그와 같은 터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조선 초기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주산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논쟁을 벌였다는 야사가 전해진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장했는데, 인왕산을 주산으로 할 경우 궁궐뿐 아니라 도읍 전체의 공간 배치가 동향으로 이루어지고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면 남향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때 무학대사가 탄식하며 “분명 200년 후에 내 말이 생각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200년 후 임진왜란과 더불어 국가의 위기가 닥쳤으며, 무학대사의 신묘한 풍수술에 후세 사람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야사일 뿐이다. 실제로 무학대사가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자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인왕산을 주산으로 할 경우 드러날 문제점을 무학이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다. 즉 인왕산 아래 주 건물(궁궐)들이 동향으로 들어설 경우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청계천이 그대로 보여 풍수에서 가장 꺼리는 바가 된다. 또한 북악산이 좌청룡이 되는데, 그러면 북악산이 삐딱하게 몸을 비틀고 있어 모습이 흉하다. 뿐만 아니라 우백호 위치에 있는 남대문 지점이 푹 꺼져 도시 모습이 더욱 흉하게 된다.
혈 맺히고 반듯한 모양 주산 될 자격
이렇듯 주산은 공간 배치에서 중심 구실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풍수에서 주산(또는 진산)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것이 터 잡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주산의 크기나 높이, 모양에 따라 아래 들어서는 터의 성격이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산은 주변의 산들보다 훨씬 웅장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악산과 인왕산을 둘러싼 주산 논쟁이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입을 빌려 나오게 된 것이다. 비록 북악산이 인왕산보다 몇 미터 정도 높긴 하지만 크기에서 보면 인왕산이 훨씬 크므로 어느 산이 주산이 돼야 할지 가리기 어려워진다.
또 주산은 혈이 맺히는 곳으로서 모양이 반듯해야 하며, 붓 모양으로 뾰족한 산, 노적봉 모습의 산, 솥단지나 종을 엎어놓은 듯한 산만이 주산이 될 자격이 있다.
주산은 도읍지뿐 아니라 무덤을 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사진 1은 어느 이름 모를 무덤으로 뒤에 바위를 주산으로 삼아 자리 잡았다. 풍수에서 바위는 흙이 압축된 것으로서, 지기가 강하게 응결된 괴이한 혈(怪穴)로 본다. 이때 바위 모양 역시 둥글거나 반듯해야 한다. 찌그러지거나 깨진 바위는 주산이 될 수 없다.
사진 2는 전북 부안 곰소초등학교의 주산으로, 옛날 시골 초등학교의 터 잡기에서도 풍수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진 3은 경북 봉화군 유곡2리(토일 마을)에 위치한 안동 권씨 종가 서설당(瑞雪堂) 전경이다. 이곳 주산(망월봉)은 반듯하며, 주산 한가운데에서 뻗어 내려오는 능선이 끝나는 지점에 종가가 자리 잡아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이런 이유 때문인지 서설당은 350년 동안이나 주인이 바뀌지 않고 전해오고 있다.
사진 4는 여수 향일암으로, 뒤에 솟아 있는 큰 바위들을 주산으로 하고 있다. 단정한 산이나 바위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바위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주산은 화기(火氣)가 강해 음택이나 양기(陽基)로서는 적절치 않으나 사찰 터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도읍지뿐 아니라 무덤이나 집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주산이 중시되는 까닭은 주산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곳에 들어서는 건물과 주변의 균형 및 조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은 오래가지만, 그렇지 못한 건물은 얼마 안 가 헐리거나 주인이 바뀌게 된다. 또 그러한 도시는 발달하지 못하고 난잡한 도시가 되고 만다.

강원 삼척시가 자랑하는 묘지 명당으로 태조 이성계의 5대조 무덤이 있다.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에 있는 이성계 5대 조부인 이양무의 무덤 ‘준경묘’와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5대 조모의 무덤 ‘영경묘’가 그것이다. 이들 무덤 주변에는 적송이 울창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풍수 호사가들과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중 풍수 호사가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곳이 천하의 명당인 까닭에 그 후손이 임금이 되었으며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졌다고 믿는 ‘소신파’고, 다른 하나는 이곳이 좋은 자리이긴 하나 임금을 배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불신파’다.
현재 풍수학 발전의 걸림돌 중 하나는 고증되지 않은 현장과 각종 자료를 근거로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준경묘와 영경묘가 그런 경우인데 이곳이 명당인지, 이성계 5대조 무덤 자리가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 고증된 것이 없는데도 마치 고증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준경묘 안내판에도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태조를 비롯한 태종, 세종 등 역대 왕들이 선조인 이양무 묘소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진위가 분명치 않아 고심했다. 그러다 고종 때 이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했을 뿐, 태조 이후 500년 동안 실종된 무덤을 찾아냈다거나 그곳이 정확한 자리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고종이 이곳을 정비한 것은 1899년으로, 태조 건국 후 500년이 지난 일이어서 강산이 변해도 수십 번은 변했을 터인테 어떻게 찾았을까 의문이 든다.
무덤 터 전설 중국 명나라와 비슷
태종 이방원 역시 조상들의 능을 매우 소중히 여겨 자신의 최측근 하륜에게 함흥에 있는 선왕의 능을 직접 살피게 할 정도였으나(하륜은 이 능들을 돌아보고 오는 길에 죽었다), 이곳 삼척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이곳을 무덤 자리로 잡게 된 전설이 중국의 전설과 비슷하다. 이성계의 4대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삼척으로 이사와 살던 어느 날, 산에 올랐다가 산길을 가던 고승과 동자승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노승이 동자에게‘저곳에 묘를 쓰면 5대 후손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간청하여 쓴 명당이라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 조부의 고사와 비슷하다.
이렇듯 여러 의문점이 있음에도 마치 사실인 양 전해오는 까닭은 조선 말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될 무렵 왕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선영을 성역화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극우 사학자들이 이성계가 여진족의 후예이므로 한국은 조선 왕조 500년간 여진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준경묘는 이성계가 한민족의 후예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물”(삼척시립박물관)이라는 대목에서도 이미 당시 일본 극우파들이 조선 왕실의 정체성을 흔들어댔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왕실 선영과 유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터의 좋고 나쁨을 풍수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태조 이성계 5대조가 이곳에서 살았고, 이곳에 묻혔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소나무 원시림 때문이다. 특히 준경묘 일대의 울창한 송림은 `황장목(黃腸木)`과 경복궁 중수 때 자재로 사용했을 만큼 질이 좋고, 너무나 아름다워 찾는 이들로 하여금 찬탄을 연발하게 한다.
소나무가 100년 수령에 20~30m 높이의 원시림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돼올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말 이후 왕실의 시조 묘로서의 성역화 작업 때문에 가능했다. 준경묘가 천하의 명당이라면 그 덕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이곳 송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무덤 앞의 명당수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대통령 5년 하는 게 나을까, 국회의원 50년 하는 게 나을까?”
“국회의원 50년 하는 게 훨씬 낫겠지. 반백 년인데!”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풍수 답사객들이 국회의원을 14선이나 배출했다는 명당 앞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다.
풍수 공부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문화센터나 사회교육원에서 3개월 정도 기본 용어를 익히고 그곳 강사가 진행하는 풍수 답사에 참석해 현장을 보는 것이다. 답사는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요일에 이루어지는데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두세 번 전국 명당을 볼 수 있다. 이들 답사는 유명 정치인이나 재벌의 선영과 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풍수의 기본을 익히는 데는 실속 있는 방법이다. 필자는 풍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인 만큼 이러한 세속 술사들의 관심이나 접근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소문난 명당에 대해서는 등섭지로(登涉之勞)를 마다 않고 달려간다.
최근에 풍수 술사들을 통해 ‘울산에 천하의 명당이 있는데 실제로 50년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7월 초 그곳을 찾았다.
부산의 풍수학인 허찬구(전 고등학교 교사) 선생이 길 안내를 해주었다. 허 선생은 조선 왕조 풍수학 고시과목인 ‘장서’를 역주(譯註)하여 펴낼 정도로 탄탄한 풍수 실력을 가진 분이다. 찾아간 곳은 울산-강동 간(7번 국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 하상면 정자동(연암) 무룡산(울산에는 무룡산이 이곳 말고도 또 있다) 아래였다. 알고 보니 부산을 지역구로 16대까지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정재문 전 의원의 선영이었다. 정 의원의 부친인 정해영 전 국회부의장이 이곳에서 7선을 했으니 합하면 12선이다. 거기다가 정 의원의 숙부인 정일영 씨가 2선을 했다고 한다. 2대에 걸쳐 총 14선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셈이다. 이러한 까닭에 풍수 호사가들은 울산이 배출한 대표적인 신흥 명문으로 정씨 문중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덤 위치는 보검장갑형 괴혈
이와 관련해 좀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한다. 원래 이곳은 깊은 산속이라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명당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오래전 어떤 스님이 정씨 문중에 이곳이 3정승이 나올 터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정씨 문중은 그 말을 듣고 이곳을 선영으로 정했다. 과연 정씨 문중에서 3명의 정승이 나왔을까. ‘정해영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한국과 소련의 수교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정재문 전 의원의 경력으로 보아 이미 2명의 정승은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 답사객들의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곳은 풍수적으로 어떤 자리일까. 이곳 정씨 선영에는 여러 무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처는 정 전 국회부의장의 할아버지 자리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눈에 띈다.
풍수에서 땅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덤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있고 없음을 살피는 것이다. 능선을 지기(地氣)를 전달해주는 통로로 보기 때문이다. 무덤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내룡(來龍)이라 하는데, 보통 내룡은 일정한 간격마다 상하(上下·起伏)나 좌우(左右·屈曲)로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곳은 수십m의 능선이 상하·좌우 변화 없이 일직선으로 곧장 무덤을 찌르듯 힘차게 내려온다. 실제로 겁 많은 술사나 산 주인들은 이러한 곳에 무덤 쓰기를 두려워한다. 지나치게 살벌한 용 혹은 죽은 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죽은 용이나 살룡(殺龍)으로 보지 않고 긴 칼로 본다.
보검이 칼집 속에 감추어진 형태, 즉 보검장갑형(寶劍藏匣形)에 해당한다. 이때 칼집은 전후좌우를 감싸고 있는 사신사(四神砂)다. 이러한 보검장갑형에는 “대대로 장군과 재상이 배출된다(代代將相輩出)”고 풍수서는 적고 있다. 이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괴혈(怪穴)이 가끔씩 눈에 띄어 풍수 호사가들을 즐겁게 한다.

2월 초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세계한국학대회’가 열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정신문화원 후신)과 베이징대학의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학에 대한 세계학술대회였다. 필자도 ‘한반도 풍수사상의 수용과 변천사’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베이징에 내렸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베이징대학 조선어문학부 대학원생이었다. 우리말을 너무 유창하게 구사해 조선족이거나 한국 유학생인 줄 알았는데 공국희라는 한족이었다. 필자의 논문 주제가 풍수라는 것을 알고 공국희 씨는 중국에서 전해지는 풍수 야사 하나를 들려주었다.
“장제스 정권이 대만으로 밀려나기 전 국민당 정권은 마오쩌둥 주석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비열한 짓을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 주석 조상 묘를 폭격, 없애고자 한 것이었다. 다행히 고향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알려주어 큰 피해는 면했으나 장제스 군대의 무차별 폭격으로 마 주석 조상 묘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 그 까닭에서인지 마 주석을 제외한 일가 친척들에게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나 지금은 거의 후손이 끊긴 상황이 되었다.”
이는 타인의 조상 무덤을 훼손함으로써 그 집안의 번성을 방해한다는 전형적인 ‘단맥(斷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야사지만 풍수사(風水史) 전체를 놓고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몽염 장군의 비운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몽염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의 2인자로, 그는 만리장성을 쌓았던 실질적 총책임자였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뒤를 이은 후계자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렇게 탄식했다. “요동에서 임조까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맥을 잘랐겠는가. 바로 이것이 내 죽을죄다.”
중국에서 마오쩌둥 조상 묘 일화
또 수나라가 망하자 당시 민간에서는 수 왕조가 대규모 운하를 건설하면서 많은 지맥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이 조선에 인재가 나오지 못하도록 전국 곳곳의 맥을 잘랐다는 전설이나 일제강점기 때 박았다는 쇠말뚝 이야기도 맥을 자르면 재앙이 생긴다는 관념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러한 단맥은 심지어 형제간에서도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회안대군 묘 사건이다.
1400년 태조 이성계의 아들 방간과 방원(태종) 사이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요즈음 재벌 2세 사이에 발생하는 ‘왕자의 난’의 원조인 셈이다.
왕자의 난에서 패한 방간(회안대군)은 포로로 잡힌 뒤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곧 사면되어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된다. 얼마 후 방간은 전주로 유배지를 옮긴다. 유배생활 20년이 흐르면서 형제간 살육의 감정이 누그러지자 태종은 형님 회안대군을 한양으로 올라오도록 한다. 그러나 회안대군은 한양으로 오던 중 충남 은진에서 병사한다.
이때가 서기 1420년, 회안대군 나이 57세 때다. 회안대군 묘비 문은 ‘이때 태종은 예장(禮葬)의 예를 베풀고 지관 세 명을 파견하여 무덤 자리를 잡게 했는데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오는 형상인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의 명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비문에는 없으나 후손들 사이에 전하는 이야기다.
장례를 치르고 상경한 지관들이 태종에게 경과를 보고하자, 태종은 그 자리가 어떠냐고 물었다. 이때 눈치 없는 지관이 ‘군왕이 나올 정도’로 좋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태종은 회안대군의 자손이 군왕이 되는 것을 염려해 곧바로 사람을 보내 회안대군 무덤 뒤 맥을 자르게 했다. 그렇게 하면 방간 후손의 번창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회안대군의 무덤 뒤 산 정상에 올라보면 여기저기 심하게 골이 파인 흔적이 보인다. 그때 수백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맥을 자른 흔적이라고 한다. 최근 이곳을 답사했을 때 회안대군의 후손이 세웠는지 ‘혈맥을 자른 흔적’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어 600년 전의 일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어느 교당(뒤로 연세대 뒷산이 보인다, 왼쪽부터).
풍수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시인 김지하 선생은 “공간의 의미는 역사가 변해도 퇴색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파발에 버스정류장, 주유소, 물류보관소 등이 들어서는 것도 땅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립대 이규목 교수는 노르웨이 건축가 노베르크 슐츠가 말한 ‘장소의 영혼(spirit of plac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특정 장소가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다면 이는 그곳을 지켜주는 혼이 있기 때문이며, 이 영혼은 사람과 장소에 생명을 주어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따라다니며 그 장소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땅마다 성격이 달라 그에 걸맞은 쓰임새가 있다는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는 성룡사, 예장 신촌교회, 원불교 신촌교당, 밀알성도 예수 그리스도 등 ‘신의 집’이 밀집한 곳이 있다. 연세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저 그런 ‘신의 집’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해당 종단의 중추적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룡사의 경우 천태종 서울본부다. 천태종의 총본산은 충북 단양 구인사다.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문 때문에 신도 수가 대단히 많은 곳이다. 예장 신촌교회도 신도 수가 엄청난 서울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다. 또한 밀알성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곳이 중앙본부다. 특히 이곳은 자신의 조상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구원 의식을 베풀기도 하는 곳으로, 일반 교회가 하는 일 이외에 우리의 사당과 같은 기능을 하는 점이 특이하다. 원불교 신촌교당 역시 4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곳의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일대는 신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 건물이 들어서서 번창한 땅인 셈이다. 단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파의 교당이 밀집한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풍수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전통적으로 풍수에서는 땅에 따라 태어날 인물이 다르다는 것에 거의 모든 풍수 서적들이 동의한다.
예컨대 조선조 풍수학 고시과목 가운데 하나였던 ‘명산론’은 땅을 신선이 나올 땅, 장군이나 재상이 나올 땅, 부귀한 사람이 나올 땅, 시정잡배가 나올 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개 땅과 사람의 생김새를 유비적(類比的)으로 관계 지은 데서 생겨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풍수 고전(조선조 풍수학 고시과목)들이 사당, 절터, 도관(道觀) 등 ‘신을 모시는 땅’에 대한 특성을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수서가 언급한 ‘신을 모시는 땅’의 특성은 어떤 것일까?
조선조 지관 시험과목 가운데 하나였던 ‘감룡경’에서는 바위가 줄줄이 이어지는 곳과 좌우에 감싸주는 산이 없는 경우에 ‘신단(神壇)’이나 ‘신우(神宇)’가 들어설 곳이라고 했다.
‘명산론’은 ‘신의 집’터로서 다음과 같은 곳을 언급했다.
“신단이나 사당은 산이 끝났지만 좌우에 감싸주는 산이 없어 기가 모이지 않는 곳, 고단무정(孤單無情)한 곳, 흉한 산들이 있는 곳에 많고, 도교나 불교의 건물들은 명산의 궁벽한 곳에 많다.”
이와 같은 기준들에 창천동 종교 건물들이 밀집한 곳이 부합하는 것일까?
그 일대가 모두 건물들로 빽빽이 들어찬 데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여 지형지세를 첫눈에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건물들이 능선 위에 있는 탓에 주변에 감싸주는 산들이 없어 고단무정함을 알 수 있고, 땅속이 거의 모두 석맥(암괴)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성룡사 법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일대가 신의 집터로서 풍수 고전이 언급하는 대목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땅마다 쓰임새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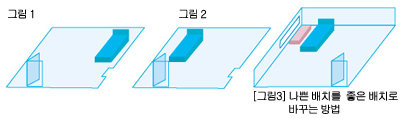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 가운데 어느 것이 풍수적으로 좋은 침대 배치일까?
웰빙이란 용어가 유행하면서 풍수에서도 ‘웰빙 풍수’가 등장하고 있다. 풍수가 역사·사회적 개념임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데, 온돌을 사용하던 농경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택 풍수가 생겨나더니, 초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등장하면서 공간 내부만을 풍수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인테리어 풍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인테리어 풍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현재 시중에는 수십 권의 인테리어 풍수 서적이 나와 있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지형지세와 주거공간을 염두에 둔 풍수가 아니라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 유입된 것들로, 일부 서적은 동일한 공간을 두고 상반되는 배치를 하고 있어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도 풍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답은 ‘원래 없었다’이다. 일찍이 도시화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자본주의에 걸맞게 풍수를 상품화한 것이 바로 인테리어 풍수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최근에는 구 사회주의 국가까지)에 유입되면서 그들의 공간문화에 맞게 다시금 변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테리어 풍수를 그대로 우리의 주거 및 사무실 공간 배치에 적용하려 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고, 자칫 ‘풍수 사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풍수가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인테리어 풍수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풍수 문외한이라도 원칙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원칙을 갖고 인테리어 풍수가 이용되는지 침대 배치를 예로 하여 살펴보자.
첫 번째 원칙은 ‘그림 1’처럼 출입문과 대각선 방향에 배치를 해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림 2’처럼 출입문을 마주 보면 흉한 것으로 여기는데, 흔히 이를 ‘죽은 자를 위한 침대 배치’라고 한다. 풍수이론 원류지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림 2’처럼 침상을 출입구에 마주하게 한 뒤 시신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혼(魂)이 빨리 출입구를 통해 하늘로 날아간다(혼비·魂飛)고 믿었다. 혼이 날아가고 남은 시신에는 백(魄)이 있는데 이를 땅에 묻으면 흩어진다(백산·魄散)고 믿었다(묘지 풍수가 나온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두 번째는 침대머리가 벽 쪽을 향해야 한다. 창문이나 창문과 평행(그림 3)해서는 안 된다. 묘지뿐만 아니라 전통 취락 구조는 ‘배산임수(背山臨水)’다. 즉 뒷산에다 등을 대고 집이나 묘지를 앉힌 후 낮은 쪽의 물을 바라보는 공간배치를 이상적으로 여긴다. 이러한 배산임수 공간배치 관념이 침실에도 적용되는데, 벽을 산(山)으로 창은 물(水)로 보고 침대 배치를 하는 것이다. 사무실 책상 배치도 바로 이와 같은 원칙에서 한다.
그런데 방 안에 장롱이나 화장대 혹은 책상이 한쪽을 차지, 이와 같이 침대 배치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보완책이 있다. 이를 비보진압(裨補鎭壓) 풍수라고 한다.
‘그림 3’의 경우 침대가 창문과 평행으로 배치되어 금기사항을 범하고 만다. 이 경우 ‘그림 3’처럼 창문과 침대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을 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림 2’처럼 출입구를 마주하고 있는 침대 배치 역시 공간이 넉넉하면 출입구나 침대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을 놓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이드 테이블’을 놓은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에서는 작은 거울(동경·銅鏡)을 일정한 방향에 달아서 해결했다. 요즈음의 경대(鏡臺) 개념이다. 이 방법 역시 서구 유럽의 인테리어 풍수에 그대로 수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침대 배치에서 풍수의 원칙은 이것이 전부이다.
‘그림 4’는 독일에서 발간된 인테리어 풍수서에 소개된 침대 배치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모두 배치가 좋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을 좋은 침대 배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인들이 썼던 것처럼 거울을 활용한다. 그림 속에 ‘Spiegel(슈피겔·거울)’이란 글자가 쓰인 지점에 작은 거울을 달면 문제가 해결된다. 거울 대신 경대를 놓아도 된다. 거울이 나쁜 기운을 반사해 내보낸다는 뜻으로 풀이하지만, 이렇게 거울을 두면 방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더 편안한 배치구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는 제주의 맥을 잘랐다는 악명 높은 중국인 지관 ‘호종단(胡宗旦)’과 관련된 전설이 여기저기에 전한다.
“중국 송나라 황제가 풍수서를 바탕으로 고려국의 지세를 보는데 탐라국(제주)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나와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래서 풍수에 능한 호종단을 급파해 제주 전역에 혈을 뜨도록(지맥을 자르는 것) 하였다. 명을 받은 호종단은 제주도 동쪽 ‘종달리’에 도착하여 혈을 뜨기 시작하였다(‘종달’이란 지명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는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거쳐 서쪽을 돌아 제주 전역의 맥을 자르려 하였다. 그러나 남원읍 의귀리에서 한라산신의 방해로 더 이상 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가다 한경읍 차귀도에서 풍랑을 만나 죽었다. 한라산신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다. 비록 제주 전역에 혈을 뜨는 것을 막긴 했지만 이로 인해 제주에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삼성혈 포위하며 맥 잘라 … 제주민들 거센 저항

중국인이 조선에서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맥을 잘랐다는 단맥(斷脈) 모티브이다. 그런데 호종단이 제주도의 맥을 잘랐다는 전설은 조선 초 명나라 풍수 서사호(徐師昊)가 단천(端川)에 황제의 기운이 서려 있다 하여 맥을 잘랐다는 전설이나,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조선 전역의 맥을 잘랐다는 전설보다 몇백 년 앞선 12세기 초의 일이다. 제주도는 본래 탐라란 독립국이었는데, 이를 복속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풍수 침략’이었다.
전설처럼 호종단은 중국 사람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탐라국에 대한 풍수 침략의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고려 왕조였다. 호종단은 ‘고려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호종단은 중국 송(宋) 때의 복주(福州) 사람이다. 일찍이 중국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으며 상선(商船)을 따라 고려에 왔다. 글을 잘하고 염승술(厭勝術·비보진압 풍수)에도 능해 예종의 총애를 받았다. 예종이 죽었을 때 ‘고려사’ 사관은 예종이 호종단의 풍수설에 지나치게 빠졌다고 비판했다. 예종에 이어 인종 때도 호종단은 ‘기거사인’의 직책으로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호종단의 행적이 어찌 되었는지는 ‘고려사’에 전혀 언급이 없으나, 호종단과 제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다.

제주에서 탐라란 국호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서기 1105년(고려 숙종 10년)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탐라국 왕의 지위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 제주를 통치하였다. 그런데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은 재위기간(1105~22) 중 국력 신장을 꾀한다. 호종단이 예종의 총애를 받아 고려의 ‘국가 풍수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이다. 이때 호종단이 제주에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탐라국 지배층은 고려에 복속되었지만 토착민들은 고려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고려 왕실은 이들을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
호종단이 제주에 처음 도착한 구좌읍 종달리는 탐라국 근원지인 삼성혈(高, 良, 夫 세 성의 시조가 나온 곳으로 이들에 의해 탐라국이 세워짐)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호종단은 여기서부터 삼성혈을 포위해가면서 맥을 잘라나갔다. 호종단의 행로를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구좌읍 종달리→표선면 토산리→남원읍 의귀리 및 수망리→서귀포시 서홍동→남제주군 안덕면 산방산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호종단이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곳).
삼성혈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한라산을 빙 돌면서 맥을 자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이고 치밀함이 보인다. 차귀도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제주인의 저항으로 호종단 일행이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고려 왕조의 탐라국 복속을 위한 마지막 조치가 바로 풍수 침략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로부터 800년 후 일제가 한반도에 풍수 침략을 한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건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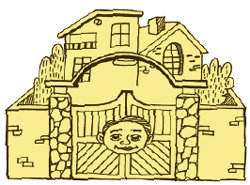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아놓는 것이 좋을까, 열어놓는 것이 좋을까.’
서구에서 유행하는 인테리어 풍수 내용 가운데 하나다. 탈취나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열어놓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테리어 풍수서에서는 뚜껑을 닫아놓아야 집 안의 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재물이 모인다고 설명한다. ‘건물도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풍수적 전제에서 말한 것이다. 풍수에서는 집이나 사무실도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물론 묘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유기체의 건강상태나 기의 충만 여부를 살펴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나 그 후손들의 길흉화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풍수 논리다. 집이나 사무실 혹은 묘지를 살아 있는 생물체로 본다면 그곳에도 입, 몸통, 팔다리 그리고 항문이 있음을 전제한다.
문이 입이라면 변기는 항문에 해당된다. 건강한 사람은 항문의 죄는 힘이 강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은 항문이 점차 벌어지는데,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임종 시기를 판단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집의 항문에 해당되는 변기 뚜껑을 닫아놓아야 집 안의 기운, 특히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기 드나드는 문과 담 중요한 구실
변기 뚜껑만이 아니라 문(현관·출입문)의 위치나 크기도 중요하다. 문은 단순히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기(氣)가 드나드는 곳이다. 좋은 기가 드나드는 건물은 건강해지고, 나쁜 기운이 드나드는 건물은 나쁘게 된다. 그래서 대문은 집의 얼굴에 비유된다. 집의 얼굴이 제자리에 있어야 잘된다. 어떻게 하면 제자리에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것은 그 터에서 가장 낮은 곳 부근에 세우되, 인접한 길보다는 약간 높게 하면 된다.
문뿐만 아니라 담 역시 풍수에서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담은 마치 사람의 옷과 같아서 적절한 가리개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 다양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담 허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관공서라면 몰라도 학교나 개인 건물에서는 기를 흩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외국의 예를 들어 담 허물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이기 때문에 물길과 바람 길이 일정치 않다. 이것들이 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인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사람의 길이 잘못 만들어져 서로 충돌하면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때 담은 사람의 길, 바람 길 그리고 물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주는 일을 한다. 그렇다고 담을 벽돌이나 콘크리트, 돌로 높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터에 따라 나무 몇 그루, 바위 몇 개만 세워놓아도 훌륭한 담이 될 수 있다.

흔히 경매 물건들은 터에 문제가 있거나 재수가 없다고 꺼린다. 이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제로 터에 문제가 있어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다. 건물 등기부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소유자가 자주 바뀌지 않았는데도 경매로 나온 경우다. 이런 터는 문(대문·정문)의 위치와 담의 높낮이만 바꾸어도 좋은 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풍수 논리다. ‘리모델링’ 개념과 비슷하다.
이것은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을 좋게 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회사가 정체될 때 사옥을 옮기거나 사무실의 공간배치를 재조정해보는 방법이다.
취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자꾸 낙방하여 안타까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풍수적 조언을 하자면 ‘공부하는 장소를 바꿔보라!’는 것이다.
공부하는 장소를 바꾸면 다니는 학원, 강사, 교재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즉 기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풍수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기분 좋게 삶을 준비하거나 꾸려나가려는 적극적인 운명 개척론이다

중국 베이징 여행지는 대개 쯔진청(紫禁城), 완리창청(萬里長城) 그리고 명십삼릉이다. 쯔진청과 명십삼릉은 풍수를 근거로 터잡기와 공간배치가 이루어진 곳이다. 조선 왕궁이나 왕릉 역시 풍수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 문화유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먼저 명십삼릉 풍수에 대해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와 비교해가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명십삼릉은 명나라 황제 13명이 묻힌 곳이다. 베이징에서 서북쪽으로 40여km 떨어져 있어 완리창청과 함께 하루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풍수적 관점에서 명십삼릉을 보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아쉽게도 13릉 가운데 두 곳만 개방하고 있어 온전한 풍수답사가 불가능하다.
조선의 왕릉도 능 뒷산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으나 규모가 작아 살짝 들어갔다 올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의 능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
명십삼릉에 관한 책 ‘황릉의 비밀’(위에 난·양스 공저)이 국내에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미리 읽어보고 여행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책에서는 명십삼릉 터가 정해지기까지의 풍수적 과정도 소개되고 있다.
명십삼릉은 명나라 제3대 황제 영락제(永樂帝, 1360~1424)가 당시 최고의 풍수 술사로 알려진 요균경(寥均卿), 증종정(曾從政), 승려 인오영(人吳永) 그리고 예부상서 등을 보내 2년 동안(1407년 7월~1409년 5월) 베이징 주변을 돌아보게 한 뒤 잡은 자리다. 요균경과 증종정은 당나라 이래 대대로 풍수를 가학으로 이어온 요우(寥瑀)와 증문천(曾文)의 후손이다.
당시 터를 잡는 과정을 보면 황당한 장면들이 나온다. 처음에 이들은 완리창청 북쪽 도가영(屠家營)을 황릉 후보지로 정한다. ‘도가영’의 도(屠)는 ‘짐승을 잡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의 성씨는 주(朱)인데, 주(朱)와 돼지를 의미하는 저(猪)의 발음이 같아서 돼지(朱=猪)가 도가(屠家)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살된다는 생각 때문에 취소한다.
두 번째 후보지는 창평(昌平) 서남에 있는 양산(羊山)이었다. 양과 돼지(朱=猪)는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을 듯했다. 그런데 양산 뒤쪽에 사나운 짐승 이리(狼)의 글자를 딴 ‘낭아욕(狼兒)’이란 마을이 있어 문제가 된다. 돼지 근처에 이리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자리가 후보지로 선택된다. 1409년 영락제가 직접 살핀 뒤 자신의 능으로 확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릉(長陵)이다. 이후 이곳은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13명의 황제가 묻힌 능이 되었다.
명십삼릉의 터잡기 과정에서 황제의 성씨 주(朱)가 돼지를 뜻하는 저(猪)와 소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돼지에 위협적인 글자가 들어간 지명을 피한 것을 보면 어리석은 터잡기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풍수지리는 지리의 이점(地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은 완리창청에서 멀지 않은 곳이면서 베이징의 북서쪽으로 북방 이민족이 중국을 침략하는 통로였다. 이곳을 철저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베이징은 위험하다.
황릉이 조성된 이후 이곳에 군대가 배치되어 황릉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민족 침입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즉 영락제가 좋은 무덤 자리로부터 찾았던 것은 튼튼한 국가 안보와 황실의 무궁한 번영이었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명당발복’이 아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풍수지리는 ‘지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명십삼릉을 정했던 영락제는 자신의 장조카이자 2대 황제인 혜제(惠帝)를 죽이고(일설에 의하면 그가 도망갔다고 함) 황제에 올라 황실의 권위를 강화했다. 역시 자신의 장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조선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켰던 수양대군 세조와 비슷하다. 두 임금 모두 풍수를 몹시 신봉했다. 그러나 이 둘의 무덤 터 잡기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다. 조선 세조의 능(광릉: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는 ‘지리(地利)’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왕릉을 답사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답답함이다.
권명당설의 허구

2002년 11월 말 LA 타임스 서울 지국장 바버라 데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주제는 ‘얼마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풍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였다.
그런데 인터뷰 중 개개인에게 생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데믹 지국장이 “나의 생가는 미국의 어느 산부인과인데, 그럼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은 다 똑같단 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도 요즘 거의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 그리고 신생아가 산부인과에 있는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이다. 그런 만큼 산부인과가 아니라, 신생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던 터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터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바로 그런 뜻에서의 생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풍수에서 말하는 생가란 이렇듯 태어난 순간의 장소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라던 터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의 터를 말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2004년에 개최된 ‘세계생명문화포럼’에서 민주언론운동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이 “한 인간의 잉태 순간이 일생을 좌우”하며 “뱃속에서 하루 잘 키우는 것이 낳아서 열 달보다 중요하다”고 한 바 있다. 이는 “훌륭한 자녀를 두려면 부부가 명당 터에 잠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암도 스님(전 백양사 주지)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무덤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만 못한 것”
7월 중순 일부 언론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명박 서울시장의 생가와 선영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풍수 전문가들이 조상 묘와 생가를 방문, 왕기(王氣)를 확인했다’느니 ‘서울 풍수지리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곳을 찾았다’느니 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의 생가와 선영이 왕기가 서린 명당’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왕권은 신이 주는 것이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아니라 ‘제왕은 명당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명당설(王權明堂說)’이란 용어가 조만간 생겨날 듯하다.
또 ‘서울의 풍수지리 관련 대학교수들이 생가와 선영을 찾았다’는 보도는 기사 내용의 권위를 보여주려 한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수들’이란 사회교육원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풍수적으로 대권 가능성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풍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생가(生家)이며, 두 번째가 바로 윗대 조상(부모→조부모 순) 무덤, 마지막이 현재 사는 집터다. 그만큼 풍수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집터를 중시한다. 그런데 이 시장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동네 사람들 증언). 때문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 마을을 찾아가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곳이 생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의 선영이다. 흥해읍 덕실 마을을 지나 산을 넘어 신광면 만석2리에 조부모 묘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송갈1리(영일목장)에 부모 묘가 있다. 이곳을 둘러본 최낙기(선문대 강사) 씨는 ‘고인들에게는 편안한 양지바른 곳이지만, 특별히 풍수설을 믿고서 쓴 자리는 아닌 듯하다’고 평한다.
송나라 사람 채원정(蔡元定)이 쓴 풍수서 ‘발미론’은 조선 사대부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책이다. 이 책에는 “음지호 불여심지호(陰地好 不如心地好)”란 말이 있다. ‘무덤(陰地)이 제아무리 좋아도 마음(心地) 좋은 것만 같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는 풍수 논리도 결국 공동체 선을 위한 공명정대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왕이나 대통령의 경우 시대정신(天時)을 정확히 읽고 이를 구현해나갈 의지가 있는 이에게 땅의 이점(地利)이 주어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삿(私)된 야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모든 풍수서가 강조한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만 많다고 좋은 일은 아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아야 무한경쟁 속에서 한국을 강국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훌륭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세기 초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가 쓴 ‘태교신기(胎敎新記)’란 책이 있다. 태교에 관한 고전으로 위당 정인보 선생도 이 책에 대한 서문을 쓸 정도였다(1936년). 현재 몇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그 어떤 책보다도 우선적으로 권장할 만한 책이다.
‘태교신기’의 저자는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의 태중 열 달 가르침만 같지 못하고, 어머니의 태교 열 달이 아버지가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師敎十年未若母十月之育 母育十月未若父一日之生)”고 했다. 즉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잠자리와 그 시간 및 상황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풍수서 ‘호순신’에 나와 있는 “사람은 땅의 기운에 따라 청탁(淸濁), 현우(賢愚), 선악(善惡), 귀천(貴賤), 빈부(貧富), 요수(夭壽·단명과 장수)에 차이가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잠자리 시간과 상황이 아이 운명 결정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져야 할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풍이 불 때는 절대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또한 근친결혼을 하면 자손이 줄어들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태백, 도연명 같은 시인들이 말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지만 그로 인해 후손들은 우둔했다. 이밖에도 큰 바위 근처나 귀신을 모시는 곳(사찰·사당), 무덤·감옥·전쟁 터였던 곳은 피해야 한다. 기후와 풍토가 태아에게 그대로 전해져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터 명당으로 소문난 곳을 찾아가서 아이를 갖는 것이 좋다.
‘준비된 아이 만들기’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충북 옥천 육종관 씨의 경우다.
육종관 씨는 1920년대 중반 명당으로 소문난 충북 옥천 교동의 삼정승 집터를 사들였다. 이 집은 1600년대의 김 정승, 이어서 송 정승, 민 정승이 나온 곳으로 재력가 육 씨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민 정승의 후손인 민 대감에게 전 재산의 절반인 2만500원을 주고 이 집을 샀다. 즉 정승이 나올 집터를 골라 이사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훌륭한 자손을 두기 위함이다. 이곳에 이사해 처음 태어난 아이가 육영수(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여사였다(1925년). 육 여사가 태어났을 때 육 씨는 “아들이냐, 딸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딸이라고 답하자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시인 박목월이 쓴 육 여사 전기 참고).
육 씨는 육 여사 이외에 22명의 자손을 두었으나(소실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포함), 이곳에서 태어난 이는 육 여사와 동생뿐인 듯하다. 교동은 이밖에도 시인 정지용 생가와 옥천 향교가 자리할 만큼 전체가 좋은 땅이다.
물론 이처럼 소문난 명당이 요즈음에 어디 있으며, 설사 있다 해도 마음대로 가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명당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시골의 빈집과 빈 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에서 태어나 객지에 가 성공한 사람들의 집터, 그곳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모두 별 탈 없이 장성한 집터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한 곳에 가서 아이를 갖고 낳으며, 또 최소한 어린 시절만큼은 그러한 곳에서 바람소리·새소리를 듣게 하고, 산과 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풍수가 지향하는 인걸지령론이다.

서구 학문 가운데 지정학(geopolitics)이 있다. 이는 한 나라가 처한 지리적 조건이 국제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정학자들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나 사회경제 체제가 어떻게 변하든 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 환경 탓’이라는 것이다.
풍수에도 지정학과 유사한 것이 있다. 한 나라 혹은 도읍의 위치와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의 관련성을 따져보는 국역풍수(國域風水)가 바로 그것이다. 한반도 풍수에서 보면 조선보다는 고려 왕조에서 이를 더 비중 있게 다루었다. 위정자들에게 국역풍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천도론이나 삼경제도 같은 것도 국역풍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좌청룡 우백호 수백km 떨어진 곳에 위치
중국의 역대 도읍지 변천사를 보면 흥미롭다. 크게 보면 숱한 왕조의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역대 왕조들은 베이징을 가장 선호했다. 베이징을 지도에서 보면 중국의 중심지라 할 수도 없고 기후도 그리 좋지 않다. 또 멀지 않은 곳에 만리장성(萬里長城)이 있어 이민족과 바로 국경을 접하는 곳이다. 상식적으로 보아 썩 좋은 위치가 아닌 듯 여겨진다.
안읍(安邑), 호경(鎬京), 낙양(洛陽), 함양(咸陽), 장안(長安), 남경(南京), 건강(建康) 등 많은 도시들이 한 왕조의 도읍지가 되었지만 베이징처럼 몇 대 왕조에 걸쳐 도읍지의 지위를 차지한 적은 없었다. 금, 원, 명, 청에 이어 현재 중국 수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베이징은 도읍지로 구실해온 것이다.
위대한 사상가는 직관으로 터의 성격과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성리학의 대가 주자(朱子, 1130~1200)는 일찍이 베이징 일대를 역대 도읍지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보았다. 주자는 풍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자인 채원정(蔡元定)에게 본격적으로 풍수 공부를 가르쳤고, 65세 때인 1194년 송 황제 영종(寧宗)에게 ‘산릉의장(山陵議狀)’이라는 글을 올려 풍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파한다. 그러한 주자인 만큼 중국 전역의 풍수에 이미 통달하고 난 뒤 베이징의 풍수를 논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주자는 베이징 일대를 풍수적으로 다음과 같이 논했다.
“기도(冀都·현재의 베이징 일대)는 세상에서 풍수상 대길지다. 운중(雲中)에서 출발한 맥을 이어받고, 앞에는 황하(黃河)가 둘러싸고 있으며, 태산(泰山)이 왼쪽에 높이 솟아 청룡이 되고, 화산(華山)이 오른쪽에 솟아 백호가 된다. 숭산(嵩山)이 안산이 되고, 회남의 여러 산이 제2 안산이 되고, 강남의 여러 산이 제3 안산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여러 도읍지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주자어록’)
서울과 비교해보면 중국인들의 과장된 풍수관에 황당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청룡은 낙산(동대문 부근)이고, 백호는 인왕산, 안산은 남산으로 왕궁에서 불과 몇 km 떨어진 지근 거리에 있다. 한강 역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도읍지인 서울을 감아돌고 있다. 반면 베이징에 가서는 서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산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한강에 해당되는 황하, 인왕산과 낙산에 해당되는 태산과 화산, 그리고 안산에 해당되는 숭산이 베이징으로부터 수백 km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 서구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국역풍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정된 곳, 가장 좋은 기운이 뭉쳤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곳으로부터 등거리(等距離)의 모든 땅을 통치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으로는 강남 아래까지, 북으로는 몽골(蒙古), 동으로는 한반도, 서로는 티베트와 신장(新疆)까지를 아울러 천하가 중국 땅이 아닌 곳이 없게 하겠다는 중국인의 풍수관이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북공정’ 역시 이와 같이 잠재된 중국인의 풍수관의 발로로 여겨진다.
길 때문에 氣 막혀 모두 쪽박

풍수서 ‘입택입식가(立宅入式歌)’에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터 8곳이 나온다. 폐허가 된 옛터, 감옥 자리, 전쟁 터, 무덤 터, 문 앞으로 도로가 많은 곳, 물이 집(건물) 뒤를 치고 들어오는 곳, 음지, 늪 지대가 그곳이다. 물론 토목·건축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땅들이 주는 불리한 여건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러한 터들은 과거 전력(?) 때문에 누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흉가(凶家) 혹은 귀신 나오는 집(터)으로 소문나 가끔씩 TV에 소개되고, 더러는 흉가체험 동호인들에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잠깐 머물다 갈 곳으로 여전히 유효한 곳
2005년 10월 어느 날 저녁 9시 무렵, 나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해수욕장 맞은편 산 끝에 있는 어느 폐가(廢家)를 찾았다. 그보다 몇 시간 전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장사리해수욕장에 내렸다(포항에서 30여분 거리).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소문으로 떠도는 ‘백사장 맞은편에 있는 흉가’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찍어두었다. 저녁 8시쯤 장사리해수욕장 부근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주인에게 ‘귀신 나오는 흉가가 어디인지’ 물었다. 낮에 찍어둔 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주인은 자세한 내력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다. “1980년대 건물이 지어진 뒤 음식점, 술집, 절집 등으로 몇 번씩 용도와 주인이 바뀌었지만 모두 망했다. 6·25전쟁 중에 근처에서 상륙작전을 벌였던 학도병들이 많이 죽어 이곳에 묻혔다. 또 언젠가는 인근 부대에 근무하던 군인과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임신한 처녀 하나가 이곳에서 목을 맸다….”
포항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 옆 여기저기에서 비춰대는 불빛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흉가를 찾았다.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저기 쓰레기더미가 희미하게 보여 어둠 속에서도 폐가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한때 거실이었던 곳에는 침대 매트리스가 뒹굴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다. 갑자기 2층에서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순간 등이 오싹했다. 애써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마당만 잠시 배회하다 장사리해수욕장 부근에 잡아둔 여관으로 발길을 돌렸다.
흉가는 7번 국도 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전망이 좋았다. 그러나 바람이 유난히 거셌고, 국도에서 흉가로 이어지는 몇십 m의 길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같은 길을 걸어 다시 흉가를 찾았다. 흉가 마당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다시 불었다. 어젯밤에 불던 바람이다. 땅바닥 여기저기 암반이 드러나 보인다. 마당 한쪽 암반 위에는 새끼손가락 굵기의 작은 뱀이 똬리를 틀고 앉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최근까지도 절집으로 쓰였던지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아직도 건물 벽에 붙어 있다. 건물 안 벽 한쪽에는 ‘흉가’임을 알리는 낙서와 ‘함부로 건들면 영가(혼령)들이 달라붙어 괴롭힐 것이다’는 안내문(?)까지 쓰여 있다.
집 뒤로 가보니 산에서 이어지는 암반들이 드러나 보인다. 1950년 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서 전사한 학도병들을 이곳에 매장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의문이 든다. 전체가 암반 투성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주변에 감싸주는 산들이 없어 바람이 세고, 전체가 암반인 것이 특징이다. 이런 경우 절집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바람 때문).
흉가로 이어지는 길이 매우 어색하고 한쪽이 막혀 있다. 길 때문에 기(氣)가 막힌 형세다. 이 경우 국도에서 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뒤 나올 때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즉 들어간 길로 나오지 않게 길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주택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바람, 암반, 감싸줄 산이 없는 탓에 그저 잠깐 머물다 갈 곳(모텔, 음식점, 휴게소)으로 유효한 땅이다. 귀신이 나오는 흉가라는 주술로 이곳을 더는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 땅을 풀어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건물을 헐고 원래의 모습인 자연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다.

한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구식 주택 양식 가운데 하나가 거실(居室)이다. 영어로는 living room, 독일어로는 Wohnzimmer로 표기하는데 ‘사는 방’ 혹은 ‘거주하는 방’으로 번역된다. 거실문화는 우리 시대 주거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거실은 가족의 공유 공간이며 동시에 손님들을 맞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중심지다. 그래서 거실을 ‘집의 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실에 흐르는 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집안의 길흉화복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다. 거실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장소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집안의 쇠락을 가져온다.
거실에는 다양한 가구들이 자리한다. 비교적 큰 평수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거실 한쪽에 주방과 식탁이 있다. 그리고 소파, 피아노, TV, 스탠드형 에어컨, 책장,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자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구 하나하나의 위치를 모두 풍수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다.
먼저 거실은 조명이나 벽지 등을 활용, 비교적 밝게 해야 한다. 거실에 배치된 가구들은 너무 화려해서는 안 된다(수수함과 겸손한 배치가 복을 부른다). 소파를 놓을 경우에도 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거스르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야기한다. 주인이 창문을 등지고 앉는 소파 배치는 좋지 않다. 벽을 등지고 앉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현관과 창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소파가 벽면에서 너무 떨어져 있거나, 현관문 바로 옆 또는 현관문과 마주하는 것도 좋지 않다. 현관문과 대각선 방향에 놓는 것이 좋다(좋은 거실 배치도 참조).

소파는 현관문과 대각선 방향에 위치를
벽면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에는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TV 등을 놓아 완만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각이 지면 기가 충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컴퓨터는 방보다 거실에 두어 함께 쓰는 것이 가족의 유대와 화목을 진작하는 동시에 컴퓨터 남용과 악용을 방지해 좋다.
거실 한쪽에 식탁이 있을 경우, 각이 진 것보다는 타원형의 식탁이 기의 흐름을 좋게 한다. 또한 식탁 의자 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4개보다는 5개가 좋다(4라는 숫자가 죽을 ‘사(死)’와 음이 같다는 중국인들의 생각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서구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추세다). 이보다 많은 의자가 필요할 때는 8개가 가장 좋다(이상적인 각이 팔각).
또한 거실에 골프채를 두는 것은 흉기(凶器)를 두는 것이며, 흉기(凶器)는 흉기(凶氣)를 불러온다고 하여 꺼린다.
그 밖에 벽에 걸린 한 폭의 그림과 글씨만으로도 거실의 분위기나 집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지향하는 세계관이 반영된 그림이나 글씨를 걸어놓되, 정기적으로 바꿔 달아보는 것도 좋은 분위기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권장한다.
필자 거실에는 최근에 제갈공명의 ‘자식을 훈계하는 글(誡子)’을 걸어놓았다. 자식을 훈계하는 글이라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어서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읽곤 한다. 글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무릇 공부라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며, 재주라는 것은 배워서 얻는 것이다. 배우지 않으면 재주를 넓힐 수 없으며, 뜻이 없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학문을 이룰 수 없다(夫學須靜也 才須學也 非學無以廣才 非志無以成學).”

건물 아래에 수맥이 흐르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물에 금이 간다’ ‘공부방 밑에 수맥이 흐르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묘지 아래에 수맥이 흐르면 우환이 생긴다’ ‘수맥을 차단하려면 동판을 까는 등 수맥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두 수맥과 관련된 말이다. 풍수 강연 중에 흔히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수맥과 풍수’의 연관성에 대해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맥과 풍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물론 수맥(水脈)이란 용어가 풍수에 등장한다. 조선조 지관(地官) 선발 고시과목에 수맥이란 용어가 언급된다. 하지만 이때 수맥이란 땅 위 물길의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쓰이는 땅 밑에 흐르는 물길을 말하는 수맥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수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수맥 탐사는 유럽에서 순수하게 물을 찾기 위해 발달한 기술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온 신부들이 우물을 찾거나 가뭄이 든 논에 관정을 뚫기 위해 활용하던 것이 그 시초다. 이러한 수맥 탐사기술은 독일에서 주로 발달되었다.

유럽은 퇴적층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물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 일찍부터 지하수를 찾는 기술이 발달되었다. 수맥을 찾는 사람을 독일어로 ‘루텐갱어(Rutengaenger)’라고 하는데, 이들은 수맥뿐만 아니라 광물질(보석 포함)이나 다양한 이물질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루텐갱어가 가지고 다니는 나무를 ‘부엔쉘루테(Wuenschelrute)’라고 하는데, 독일어 사전에 ‘수맥이나 광맥을 찾는 나뭇가지로서 주로 개암나무(Haselnuss)를 활용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버드나무 생가지를 활용한다. 또 나뭇가지 대신에 추(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펜델(Pendel)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를 응용, ‘ㄱ자 막대기’ 또는 ‘엘로드(L-Rod)’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수맥 찾기 도구로 지하수나 광물질을 찾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먼저 수맥을 찾으려는 사람이 Y자 모양의 버드나무 가지를 두 손으로 잡고 수평을 유지한 채 일정 지점에 서 있는다. 그 상태에서 다른 지점으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손에 새로이 힘을 주지 않는데도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일정한 지점에서 유지되던 중력과 버드나무 가지의 평형 상태가 자리를 옮김에 따라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치에 따라 중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곳 아래에 물이 흐르거나 광물질이 있거나 커다란 동공(洞空) 등이 있기 때문. 이렇게 나뭇가지나 추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서 땅 밑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물질이 어떤 것이며,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제는 수맥이 인간 수면에 영향을 주거나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일의 수맥 관련 웹사이트나 책들에서도 수맥과 건강의 관련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수맥과 건강 관련설의 기원 가운데 하나를 고대 중국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일의 어느 수맥 웹사이트(www.baubiologe.de/)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000년 전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통용되었다. 집을 짓기 전에 지관(地官)과 상의해 땅의 잡귀가 없는 곳을 잡아야 한다.”
이 글은 터 잡기에서 풍수적 지혜를 활용했다는 말이지, 수맥을 피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땅의 잡귀 가운데 수맥이 포함된다고 말할지 모르나 전통적으로 풍수에서는 지하 수맥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웹사이트는 “수맥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짐승도 있고, 꺼리는 사람이나 짐승도 있다”고 했는데, 이는 수맥이 무조건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로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잠을 잘 못 이룬다 해서 수맥이 흐르지 않나 걱정하지 말고,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수맥 탓으로 돌리지 말라. 그래도 수맥 때문에 불안하다면 아래층에 사는 누군가가 수맥 방지용 동판을 깔았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길 바란다.

철학과 교수, 대학 총장, 국회의원, 학술원 원로회원 등을 지내고 말년에는 산속 암자에서 10여년을 선 수행과 집필 작업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고형곤(高亨坤, 1906~2004) 박사. 고건 전 총리의 아버지로 더 유명한 그는 세상을 하직하면서 시 한 편(下世詩)을 무덤 앞에 남겼다.
“山疊疊 水重重/ 何處去/ 山鳩一聲/ 飛去夕陽風/ 去不歸/ 江山寂寞/ 莫道/ 其餘事/ 天地玄黃/ 宇宙洪荒. 첩첩산중에 물길은 굽이굽이/ 어디로 가는가/ 산비둘기 한 마리/ 석양 바람에 울며 날아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강산만 적막하네/ 말하지 말게나/ 그 밖의 일들은/ 하늘과 땅, 검고도 누렇고/ 공간과 시간, 넓고도 끝이 없고.”
후설의 현상학에 하이데거, 그리고 동양의 선 사상을 체화한 그의 하세시 의미가 무엇인지는 각자 해석에 맡겨야 할 것 같다.
풍수에서 그의 무덤이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아들이 대권후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자신이 직접 이 무덤 자리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의 깊이며 좌향까지를 적시해놓았다는 점 때문이다(묘지 조성에 인부로 참여한 이의 전언).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 마을 뒷산으로 300평 규모다. 이전에 전혀 무덤이 쓰이지 않았던 생자리로 고 박사가 생전에 천광(시체 묻을 구덩이)의 위치와 깊이, 좌향까지 정해놓아 인부들이 그대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이미 소문이 난 탓인지 풍수 호사가들이 다녀간 발자국들로 인해 무덤 뒤로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반들반들하다.
풍수적으로 어떤 터일까에 대해서 시중의 술사들은 ‘지나치게 바위가 많고 천광 자리에서도 돌이 나와 마땅한 터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기가 세니 좋지 않다는 것이다.
우연일까?
필자는 몇 년 전 전북 옥구에 있는 고 박사의 선영에 대해 졸저 ‘권력과 풍수’(2002년)에서 풍수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대 대통령이나 다른 대권후보들의 선영에서 받는 느낌이 편벽됨과 자기 독단이 강하게 드러나는 성정의 땅이라면, 이곳(전북 옥구 임피면 상갈마을 선영)은 원만하면서도 완벽한 성정의 땅이라는 점이다.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우리 정치판에서… 과연 그와 같은 인물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지 의문이다.”(권력과 풍수, 163~164쪽)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조성된 고 박사의 자리는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강해서 좋지 않다는 게 술사들의 평이다.
그러나 시중 술사들과 전혀 다른 평을 내놓은 이가 있어 흥미롭다. 장남식 풍수역학연구소 소장은 이 터를 극찬한다.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치는 자리지요. 용의 비늘처럼 가지런한 바위들 행렬에 살아 있는 듯 꿈틀꿈틀 생기 넘치는 변화로움이 인상적입니다. 보통사람들은 바위를 관재수에 비유해 두려워하지만, 이는 큰 권력과 재물을 표현합니다. 큰일 속에는 작은 말썽도 있게 마련이고 그 정도 관재수는 유명세라 생각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큰일을 할 수 있지요. 경쾌하고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이 자리만 가지고서 풍수적으로 대권 여부를 점칠 수는 없다. 다른 대권후보들의 선영과 생가와의 비교 속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풍수 논리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필자가 자임하는 한반도 풍수사 정리 작업에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임은 분명하다. 근 100년을 살면서 서양과 동양 사상을 체화한 한 사상가의 풍수관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전남 최고 땅부자로 보성의 박남현(1864~1930)과 강진의 김충식(1889~1953)을 꼽는다. 이들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이 전하는데 ‘일본 천황 생일에 초대받았다’, ‘전남에서 신의주까지 자기 땅만 밟고 다녔다’ 등 촌로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박남현은 별명이 ‘박팔만’이었는데 팔만석지기에서 붙여진 것이다. 김정호가 쓴 ‘땅부자의 흥망’(김형국 편 ‘땅과 한국인의 삶’에 수록)에 박남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박남현의 아버지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할아버지 묘를 미력면 대룡산에 모신 뒤 집 안의 빈 독에 쌀과 돈이 차올라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묘가 일대(一代) 발복의 명당이었다. 박남현이 죽자마자 3500평 터에 세운 8채의 집이 불타는 등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말았다. 대한제국 말 부호들이 그랬듯이 축첩(蓄妾)에 의한 후손들의 재산 싸움으로 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을 답사하기 전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당대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까? 전설대로 할아버지 묘를 명당에 쓴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일까?
조부 무덤 거대한 암반 둘러싸인 곳
그러나 답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앞에서 소개한 내용과 달랐다.
우선 흥망사다.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문자 그대로 팔자를 잘 타고났거나 명당 발복이란 이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반면 박남현 후손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불운 탓이었다고 증손 박형준(66) 씨는 전한다.

“증조부가 당대 거부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수만금을 출연, 향교를 수선하고 성계안, 사마안 등을 간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화순 쌍봉사에서 임시정부 밀사들을 만나 자금을 전했다는데 이를 뒷받침할 기록은 없다. 더욱이 박남현의 아들 박태규(박형준 씨의 조부)는 광복 후 여운형 선생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 전남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건준 세력이 관제공산당으로 몰리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당대 명당 발복지로 알려진 곳이 정말 풍수 고전서적에서 말하는 기준과 부합하는가다. 박남현 조부 묘는 대룡산(大龍山)에 있다. 대룡산의 옛 이름은 활용산(活龍山)으로, 대룡산이 위치한 미력면의 영산(靈山)이다. 멀리서 보아도 웅장하고 서기(瑞氣)가 서려 보인다. 이곳에는 소가 누워 있는 와우형(臥牛形), 나는 용이 강을 바라보는 비룡망하형(飛龍望河形),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등 숱한 명당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썼다.
대룡산은 마치 종을 엎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또 무덤에서 앞을 바라보면 보성강 물이 무덤을 향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종을 엎어놓은 듯한 주산 무덤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 길 모양은 모두 재물이 모이는 지세라고 술사들은 해석한다.
특이한 것은 박남현 조부 무덤을 2~4m 거대한 암반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다. 풍수에서 바위는 매우 극단적으로 평가된다. 바위가 좋으면 명당 발복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지지만, 바위가 나쁘면 재앙이 순식간에 발생한다고 하여 일반 풍수사들은 ‘바위 명당’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 좋은 바위란 생김새가 둥글거나 반듯하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춰 나열된 것을 말한다. 또한 바위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무덤이 그 바위들 중심에 있어야 한다. 박남현 조부의 무덤은 이른바 바위 명당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물이 왜 순식간에 흩어졌을까? 풍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는 것이 술사들의 주장이다. 바위 명당은 신속하고도 강력한 발복을 가져다주는가 하면 반대로 주변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기와 질투, 관재구설을 부른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 번에 몰락하고 만다는 이야기다.
오십보백보 자리로 옮긴 이유는

몇 달 전 충남 한 지방신문에 이인제 의원의 선영 이장 관련 보도가 났었다. 중앙 언론에까지 퍼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 선영 이장 사건은 이후 여러 소문을 자아냈다. 이 의원이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23%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벌어진 일이다.
전통적으로 이장을 하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선 후기 왕실과 사대부들에게 풍수 고전으로 읽혔던 ‘인자수지(人子須知)’에는 이장을 해야 할 다섯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무덤이 가라앉을 때, 무덤의 풀이 말라죽을 때, 집안에 음란한 일이 생기거나 젊은 사람이 죽을 때, 집안에 패역무도한 인물이 나거나 다치는 일이 거듭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없어지고 재판이 거듭될 때’다.
조선시대에도 까닭 없이 이장 금지
다섯 가지 경우 모두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이장을 해야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장하려고 봉분을 파헤쳤는데 광중(壙中·시체가 놓이는 무덤의 구덩이 부분) 상태가 좋으면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아놓았다. 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이 의원 선영의 경우 특별히 이장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비록 그가 대권을 잡는 데 실패했지만 당시 엄청난 지지를 받았고, 지금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영 이장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풍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필자도 그런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바 있다. 다름 아니라 2002년 ‘신동아’(2월호)에 이 의원 선영에 대해 풍수적 감정을 해놓았는, 당시 그리 좋게 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고문(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의 조부 묘와 모친 묘는 산의 얼굴이 아니라 등에 해당한다. 즉 배신을 당할 수 있는 형세다. 특히 저 멀리 보이는 계룡산 정상을 포함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우백호의 기세가 무섭다. …자칫하면 천옥(天獄·산이 가깝게 둘러싸여 있는 험악한 지형)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 무덤을 향해 불어오는 역풍 역시 만만치 않다.”
필자가 이렇게 감정한 것은 당시 이 의원이 민주당 ‘황태자’로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여서 ‘대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뺀다면 별로 문제 될 것이 없는 자리다.
그렇다면 새로 이장한 자리는 풍수적으로 어떤 곳일까? 새로 이장한 자리는 기존의 자리에서 멀지 않은 맞은편 산 능선으로 옮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선문대에서 교양과목으로 풍수 강의를 하는 최낙기 선생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의 얼굴이 아닌 등 쪽에 모셔 청룡백호가 모두 무정(無情)하다. 돌줄(石脈)을 보고 자리를 잡은 듯하지만 혈장이 형성되지 않아 불안정한 자리다. 그러나 이전 자리보다는 밝아 보여 좋다. 아마추어 지관이 잡은 자리로 보인다.”
한마디로 ‘오십보백보’가 아니라 ‘오십보육십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무덤 뒤의 험석(險石)들은 풍수에서 극도로 꺼리는 금기사항인데 이를 범하고 있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인제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러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권력 지향자들이 조상의 무덤을 명당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의지’도 참된 자아와 타자의 완성(成己成物·자신과 사회 모두의 완성)을 지향할 때 국민들과의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지며, 길지(吉地) 역시 절로 주어진다는 것을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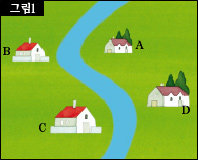
최근 강이 바라다보이는 아파트에는 조망권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다. 풍수에서는 이것이 재물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중시한다.
다음 그림1에서 터 잡기를 할 때 A 지점이 좋을까, B 지점이 좋을까?
물이 감싸 도는 A와 C 지점이 물이 등을 돌리고 흐르는 B와 D 지점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본다. 후자는 땅이 단단하지 않아 수침(水浸)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곳에 주거지가 들어서면 장기(氣·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로 인해 풍토병에 걸리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러한 곳을 생존이나 활동의 터로 잡는 것을 당연히 꺼린다. 고려 ‘훈요십조’의 금강이 배역하므로 금강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내용에서 ‘금강이 배역하였다’는 말도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즉 한양이나 개성에서 보면 금강이 그림1의 B와 D처럼 등을 보이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금강의 이러한 흐름을 반궁수(反弓水)라고 하였는데 역시 같은 말이다. 이는 두고두고 전라도 차별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풍수 고전에서도 ‘물 얻는 법’ 으뜸으로 생각
물은 바람과 함께 풍수(風水)를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산악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산길과 물길, 그리고 그에 따른 바람길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러 길들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곳에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또 과거 농업사회에서 바람을 피하고 물 가까운 데 터전을 잡는 것은 필수였다. 바람과 물 두 가지가 바로 풍수의 핵심이고 특히 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풍수 고전 ‘금낭경’에서는 “풍수의 법은 물을 얻는 것이 으뜸이고, 바람을 갈무리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라고 했다.
물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 풍수 고전 ‘지리신법’에서는 길흉화복이 산보다는 물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아 혈맥의 흐름이 순조로우면 건강하고 편안하듯 자연의 이치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 천도를 결정하자 경기도 관찰사 하륜이 계룡산 도읍지 불가론을 주장했는데, 그때 근거가 물길의 방향이었다.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물길의 방향과 흐름, 수량 등 하나하나를 중시해 수법(水法), 수론(水論), 관수법(觀水法), 득수법(得水法)이 풍수 서적이나 술사들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했다. 이 책과 저 책의 의견이 다르고, 이 풍수 술사의 말과 저 술사의 주장이 서로 다를 정도다. 그렇다면 풍수에서 말하는 물에 관한 이론, 더 나아가 풍수 이론 자체에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고증된 풍수 고전들의 주장은 대부분 비슷하다. 앞에서 소개한 것(그림1의 A와 C)처럼 물길이 감싸 도는 것, 즉 ‘환포(環抱)’를 으뜸으로 여긴다.

환포 이외에도 흘러 들어오는 물길을 바라보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여긴다. 물길이 감싸 돌거나 흘러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아파트나 건물이 자리를 잡으면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믿는다.
그림2는 강변을 바라보고 세워진 아파트 단지를 간단히 표현한 것이다.
A는 상류 쪽을 바라보고 있고, B는 강을 똑바로 보고 있으며, C는 하류 쪽을 보고 있다. 여기에서 A가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입지가 되어 길한 배치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강변 쪽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보면 방향이 제각각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풍수를 고려한 것이다. 풍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류를 향해 약간씩 방향을 틀어서 모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은 한강 조망권이 좀더 넓어져서 좋을 것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난잡하게 보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경관미를 찾아볼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몇 년 전에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가 EBS방송에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풍수적으로 비교 설명하면서 ‘고려는 법대(法大), 연대는 상대(商大)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많은 시청자와 학교 동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EBS 해당 사이트를 비난성 댓글로 도배했다. 물론 두 땅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표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실제 풍수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있다. 일정한 공간(서울)에서 중심 지역(경복궁과 청와대)을 기준으로 왼쪽을 청룡(靑龍), 오른쪽을 백호(白虎)로 보는데 청룡은 남자·명예·벼슬·장남 등을 주관하는 기운이 강하고, 백호는 여자·재물·예술·차남 등을 주관하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술사들은 해석한다.
‘조선 왕실의 경우 왕비가 더 오래 살거나 드센 반면, 왕이나 왕자 가운데 장남·장손이 단명했다’는 야사가 있다. 백호인 인왕산이 청룡인 낙산보다 더 크고 웅장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가끔 필자는 “전국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는다. 필자가 풍수에 대해 좀 안다고 하니 하는 질문이다.
물론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사람마다 성격, 인생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선호하는 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사람과 편안한 사이이면 농담으로 “서울에서는 평창동, 수유리, 성북동”이라고 대답한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이곳에 사는 것은 아니다. 직장과 너무 멀기 때문이다. 평창동과 성북동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창동과 성북동의 지세는 평창동이나 국민대에서 형제봉→보현봉 쪽의 능선을 타고 오르면 쉽게 볼 수 있다. 굳이 형제봉까지 가지 않더라도 산 능선을 오르다 뒤돌아보면 서울의 지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북한산의 중심맥(幹龍)은 보현봉→형제봉→보토현(북악터널: 고개가 지나가는 과협처過峽處로서 용의 목에 해당된다)→팔각정휴게소로 이어진다. 마치 한 마리 용이 꿈틀대며 내려가는 모습이다. 팔각정휴게소 근처에서 산 능선이 오른쪽으로는 북악산(청와대 뒷산) 방향, 왼쪽으로는 삼청터널→성균관대/ 창덕궁 방향으로 나뉜다. 보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이 한양의 중심산(主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이미 세종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한양의 핵심 진혈처를 청와대나 경복궁 일대가 아닌 가회동, 성균관대, 창덕궁 일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형제봉→보토현→팔각정휴게소로 이어지는 산 능선의 오른쪽이 평창동, 왼쪽이 성북동이다. 현재 확장된 서울의 우(右)백호 쪽에 평창동이, 좌(左)청룡 쪽에 성북동이 자리한다.
자연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 명당자리
백호는 여자·재물·예술을 주관하는 기운이 강하고, 청룡은 남자·명예·벼슬을 주관하는 기운이 강하다는 풍수의 속설에 따라 이 두 곳을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평창동은 문인·예술인·부자들이 잘되는 곳이고, 성북동은 명예와 벼슬이 잘되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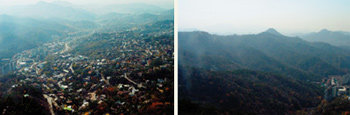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평창동에는 미술관, 아트센터, 화랑들이 많고 또 실제 많은 작가나 연예인 및 부자들이 산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북동에는 대사관, 대사관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많이 산다. 심지어 평창동에 터를 잡았던 정치인들 가운데 말로가 그리 좋지 않아 이곳을 떠나 성북동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다는 소문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혹자는 반론할지 모른다. 조선시대 때 평창동과 성북동은 사람이 살지 않거나 한미한 곳이었을 터인데 그 당시 안 좋았던 터가 지금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풍수도 역사적, 사회적 개념이다. 사회경제 체제가 달라지고 생산양식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그에 부합하는 땅의 성격이 달라진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바위가 많고 마사토로 이루어져 약간의 화기(火氣)가 보이는(기가 세다고 말할 수 있다) 평창동이나 성북동은 농민들에게 별로인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에서 자연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에게는 그곳이 명당인 셈이다.

며칠 전 어느 분이 “5·16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선 허경영 씨가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황당하면서도 그럴듯하다”면서 “풍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글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청계천 물은 중앙청 코앞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개천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가 망한다. 얼굴에 혈관을 보이게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도가 옮겨갈 뻔했던 것, 황우석 교수 사태, 두산과 삼성 그룹 사태 등 국가의 혼란스러운 일이 바로 청계천 복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1968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꼴찌였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청계천을 덮자 경제가 1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청계천을 덮고 건설된 3·1고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알리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내고 청계천을 만들었으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필자는 이미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2000년 7월 외국계 방송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청계천 다큐’를 제작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때도 그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다. 시중의 풍수 술사들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태조 이성계가 처음 한양에 도읍을 정할 때 그를 수행했던 지관 윤신달과 이한우는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북악산과 인왕산이 지나치게 바위가 많고 그 모양이 험하다. 둘째, 북서쪽(자하문)이 골이 졌다. 셋째, 개천(청계천)의 물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와 셋째의 문제점은 결국 같은 것이다. 바위산이므로 비가 오면 물을 그대로 방류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개천 수량이 줄어든다.
도성 안을 흐르는 개천을 풍수에서는 명당수(明堂水)라고 한다. 조선 왕실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청계천 명당수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1433년 세종은 명당수 수원(水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지시한다. 이때 세종은 “풍수지리설을 쓰지 않으려면 몰라도 부득이 쓰려면 풍수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고 하여 풍수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
선조는 도성의 지기가 쇠한 까닭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지기가 쇠한 이유가 바로 청계천의 끝 부분 수구(현재 광희문-동대문운동장-관묘 일대)가 벌어진 것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1600년 ‘수구막이’로서 관묘를 세우게 한다. 1760년 영조는 청계천에 쌓인 토사를 치우기 위해 대규모 준설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역시 풍수설에 따른 명당수 보전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은 한양을 완벽한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복개된 청계천의 탁한 물이 음모와 부패를 상징한다면, 복원된 청계천의 맑은 물은 정직과 번영을 상징한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완전한 것이 아닌 시늉일 뿐이라고 말한다.

풍수적으로 보아도 그렇다. 북악산, 인왕산, 남산으로 연결되는 물줄기를 복원, 자연스러운 수원을 만들어주어야 진정한 청계천 복원이다. 물줄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인왕산 너구리가 물길을 따라 남산으로 놀러 가고, 남산 다람쥐가 북악산으로 놀러 가면서 생태계가 복원된다. 그래야 산과 물 그리고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풍수가 지향하는 목표다.
지금처럼 한강 물을 억지로 역류시켜 수원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언젠가 역풍을 맞는다. 최근 서울시는 복원된 청계천 물이 시작되는 지점(水源)에 외국인 조각가로 하여금 조형물 ‘스프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높이가 20m 되는 꽈배기 모양의 조형물인데 34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풍수에서는 탑 세우기나 가산(假山) 만들기, 나무 심기, 연못 파기, 물길 돌리기 등 다양한 비보풍수를 행한다. 이는 불완전한 땅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거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런 까닭 없이 ‘꽈배기 모양의 쇠말뚝’ 을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 박는다고 한다. 풍수에서는 그럴 경우 재앙을 부른다고 해석한다. 그렇게 되면 허경영 씨가 지적한 것처럼 도참설(음양오행설에 의해 인간 사회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던 학설)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조선 명문 거족을 꼽을 때 월사 이정구(月沙 李廷龜, 1564~1635) 집안을 빼놓을 수 없다. 신흠(申欽),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알려진 월사 집안 내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이종무(李宗茂, 조선 개국 원종종신)→이회림(李懷林, 원종공신)→이석형(李石亨, 연성부원군)→이혼(李渾, 문과 장령)→(…) →이정구(李廷龜, 좌의정)→이명한(李明漢, 이조판서)→이일상(李一相, 예조판서)→(…).
이 가운데 이정구→이명한→이일상 3대가 모두 양관(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을 지내 조선 왕조 최초의 ‘3대 문형(文衡, 대제학)’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이 집안은 단순한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라 글로써 집안을 빛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월사의 조상과 후손들을 맏아들 위주로 소개했지만 차남이나 지손(支孫)들 역시 그들에 뒤지지 않았다. 특히 월사의 두 아들, 8명의 손자 그리고 15명의 증손자대에 이르러 이 집안의 번성은 최고조에 달한다(김학수 저서 ‘17세기 명가의 내력과 가풍’ 참조).
한 달 사이 5명 가족 잃고 실의 … 풍수 통해 운명 바꾸기
그러나 당대 최고의 명문가도 뜻하지 않은 우환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다. 월사가 죽은 후 1년 뒤 터진 1636년 병자호란이 원인이었다. 난리를 피해 월사의 부인과 후손들은 강화도로 피신한다. 1637년 청나라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월사의 둘째 며느리, 첫째 손자며느리가 자결을 했고, 둘째 손자 가상(嘉相, 1615~37)이 가족을 구하고 대신 죽음을 맞는다. 얼마 뒤 월사의 부인과 맏며느리가 난리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죽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5명의 가족을 잃게 된 것. 거기에 인조를 호종(扈從)하던 맏손자 일상(一相)이 척화론을 주장, 유배를 당한다.
전쟁으로 인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문의 불행은 너무 끔찍했고 집안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자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 2년 전에 돌아가신 월사의 무덤 자리로 돌려졌다. 원래 월사 무덤은 경기도 용인 문수산(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있었는데, 이곳은 조상 이석형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바로 옆에는 포은 정몽주 무덤이 있는데, 이석형은 정몽주의 손녀사위다. 정몽주와 이석형이 각각 묻힌 자리는 ‘쌍유혈(雙乳穴)’로 유명한 곳이다. 쌍유혈이란 여인의 ‘두 젖가슴처럼 생긴 자리’라는 풍수 용어다. 그만큼 이 일대가 좋은 땅이라는 뜻인데, 어찌된 일인지 월사 무덤 자리만큼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죽은 월사가 꿈에 나타나서 한 것이었다. 월사가 이곳에 안장될 즈음 큰아들 명한의 꿈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 자리가 마땅치 않음을 암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월사의 생전 풍수 실력은 어떠했을까? 월사는 광해군이 신임하던 명풍수 이의신(李懿信)의 풍수 실력이 형편없다고 임금 앞에서 말할 정도로 풍수에 정통했다. 선친의 풍수 실력을 알고 있었던 아들 명한이 집안의 우환과 선친이 꿈에 나타나는 것 모두가 무덤 탓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명한과 소한 형제는 300리 길을 마다 않고 제천에 살고 있는 이삼등(李三登)을 찾아가 길지 선정에 도움을 청한다. 이삼등이 당시 풍수계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였기 때문이었다. 이삼등의 도움으로 명한 형제는 현재의 가평군 상면 태봉리 능안 115번지에 있는 길지를 찾았는데, 그 자리는 과연 아버지 이정구가 아들 명한의 꿈에 두 번씩이나 나타나 암시한 분위기와 일치했다. 그렇게 해서 이정구의 무덤은 용인에서 가평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집안의 불행들이 이로써 말끔히 씻어지고 새로운 가문 번창을 기약한 것이다.
이는 한 집안이나 집단의 위급한 상황에서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이 풍수를 통해서 시도된 것인데, 풍수학 고전 ‘장서(금낭경)’는 ‘군자는 하늘이 하는 일을 빼앗아 천명을 바꾼다(君子奪神功 改天命)’고 했다.
이러한 운명 바꾸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다. 산 사람이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이 바로 이장이다.

얼마 전 한국국학진흥원 박원재 박사가 필자에게 “유교박물관에 서원 모형을 세우려는데 입지 선정에 풍수를 반영해야 하는가?”라고 물어왔다. 서원의 입지와 풍수의 관계를 물은 것이다.
실제 풍수답사기나 학회의 관련 논문들을 보면 적지 않은 글들이 서원 입지 선정에 풍수가 고려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원 모형이 세워지면 혹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유명한 유적지나 산소들 가운데 풍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도 풍수 호사가들이 억지로 풍수 이론에 꿰맞추어 ‘명당이다, 아니다’ 혹은 ‘터 잡은 사람의 풍수 실력이 있다 없다’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입지+자신의 처지 맞는 터 잡기가 ‘생활풍수’
질문을 받고 필자는 그동안 답사했던 유명 서원들의 입지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하서 김인후), 경남 산청의 덕천서원(남명 조식), 경기 파주의 자운서원(율곡 이이),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퇴계 이황) 등이 세워질 때 풍수설이 고려되었을까?
배산임수라는 것 빼고는 입지 선정에 풍수를 고려했다는 뚜렷한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배향된 학자들이 살고 활동했던 곳 가운데 편안한 자리를 선택했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의 답사기나 논문들이 지나치게 풍수라는 잣대로 서원이나 이들의 무덤을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풍수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후세인들이 풍수설로 설명하면 그럴듯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당(오늘날 도산서원) 입지 선정 과정을 참고해볼 만하다. 도산서원이 최초의 서원은 아닐지라도 이후 세워진 서원들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퇴계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서당 자리를 잡게 된 경위를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幷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곳은) 산이 그다지 높고 크지는 않지만, 터가 넓고 형세가 빼어나며 방위를 보아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의 산봉우리와 계곡이 모두 이곳을 향해 읍(揖)하며 감싸드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옛사람들이 산을 좋아할 때에는 반드시 명산에 의탁하던데, 그대는 청량산이란 명산에 의탁하지 않고 이곳에 거처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라고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청량산은 우뚝 솟기가 만 길이나 되고, 깊고 험한 절벽에 있어서 늙고 병든 내가 편안하게 여길 곳이 아니다. …내가 청량산보다 이곳(도산서당)을 좋아하는 것은 산과 물을 두루 갖추어 늙고 병든 나를 편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즉 풍수설 이전에, 산과 물이 편안하게 감싸는 곳으로 늙고 병든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입지 선정의 일차적 이유였다. 또 서당을 짓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밭으로 쓰고 있었는데, 근처 돌샘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은둔하기에 좋은 장소(肥遯之所)”라고 생각하여 잡은 자리다. 퇴계의 터 잡기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원래 도산서당은 퇴계의 땅이 아니었기에 넉넉하게 대금을 치르고 사들였다. 그리고 퇴계가 직접 설계를 하고 법련(法蓮)과 정일(淨一) 스님이 공사를 맡아 5년 만에 완공했다.
퇴계 자신이 요산요수(樂山樂水)하면서 은둔하기에 적절한 땅을 선택한 것이었지, 풍수 술사들이나 일부 논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풍수설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이곳에 풍수설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도 대충 부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풍수설의 본래 출발점이 퇴계와 같은 구체적인 삶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곳 도산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는 하계마을에 자리한 퇴계의 묘 역시 그렇게 해서 잡은 자리다.
주어진 입지에서 자신의 인생관이나 처지에 맞는 땅에 터를 잡는 것, 그것이 본래적 의미의 ‘생활풍수’다.

2005년 4월 동해안 산불로 낙산사가 대부분 불탔다. 특히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동종이 불에 녹는 장면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불길을 피한 곳은 의상대사(625~702)가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했다는 홍련암과 보타전 일대였다. 절과 문화재 당국은 ‘복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낙산사 복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풍수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한반도에 풍수가 유입된 것은 중국 유학승을 통해서였다. 그들이 창건하거나 머문 절들은 풍수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고려와 조선의 명풍수들 가운데 스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흔히 사람들은 유명 사찰은 모두 명당에 위치해 있으며, 그래서 큰스님이 많이 나오고 신도 수도 많다고 생각한다. 또 그러한 까닭에 절의 규모도 커야 한다고 믿는다. 아마도 낙산사 역시 화재 이전의 규모이거나 그보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 터를 잡은 의상대사가 생각했던 절의 규모나 입지가 어떠했을까를 헤아려보는 것, 그것이 풍수 논리로 본 ‘절의 진정한 복원’이다. 그러면 낙산사의 입지와 땅의 풍수적 성격은 어떨까?
터 성격 무시한 증축이 10여 차례 큰불 불러
불타기 전 낙산사를 풍수적으로 풀이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거대한 소나무 숲과 풀들이 절을 에워싸고 있어 전체 지세를 살피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산불은 주변의 나무를 태워버렸고, 불타버린 나무들은 대부분 잘라졌다. 겨울철인 지금은 잡풀마저 사라져 땅의 맨살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복원될 절의 규모나 입지가 어떠해야 할지를 맨몸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먼저 설악산 대청봉에서 낙산사로 이어지는 산 능선을 보자. 이 능선을 풍수에서는 ‘용(龍)이 내려온다’ 하여 ‘내룡(來龍)’이라고 한다. 내룡의 이상적인 모습은 위엄과 절도가 있으면서 주변 작은 능선들의 호위를 받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낙산사로 이어지는 내룡은 늙은 용이 엉거주춤 내려오는 모습이다. 주변의 곁가지 산들이 내룡을 호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각각 다른 곳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내려온 산 능선이 동해바다를 만나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춘 곳이 보타전이 자리한 움푹 파인 부분과 홍련암이 있는 암벽이다.
본래 절터 주변은 바위가 많아야 하는데, 낙산사는 전체적으로 흙산(육산·肉山)이다. 홍련암 부근에서 겨우 바위를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축 늘어진 흙산은 중심축이 돼야 할 주산(主山)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보타전 뒤 산이 주산이라고 하겠는데, 주산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설악산에서 출발한 능선이 원통보전(화재로 소실됨) 뒤를 지나 홍련암 쪽으로 흘러가는 주필산(駐山)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터는 절터로 적절하지 않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의상대사가 터를 잡았을 때 땅의 성격을 몰랐을 리 없다. 바로 홍련암 부근 암굴이 스님 한두 명의 득도를 위한 수도처로 적절하다. 또 이곳과 산 능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보타전 자리의 움푹한 부분 역시 비보사찰(裨補寺刹·자연재해나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약간의 승려가 상주하는 곳)로 알맞다.
그런데 이러한 터의 성격을 무시하고 보타전 오른쪽(정면에서 보면 왼쪽) 능선 위에 원통보전을 중심으로 범종각 등 대부분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지나가는 용(과룡·過龍)이라 하여 집 짓기를 꺼리는 곳이다. 흥하다가도 곧 패하는 속성속패(速成速敗)의 땅이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길이고 화재에 대책이 없는 곳이다. 실제 낙산사는 창건 이래 10여 차례 큰불이 있었다. 오랜 역사 동안 화재가 없을 리 없지만 이것은 지나치다.
의상대사가 이곳에 절을 지으려 했을 때의 입지와 규모, 공간배치를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원이다. 그럴 경우 홍련암 부근에는 더 이상 보조 건물을 짓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보타전이 자리한 움푹한 부분에 작고 아름답게 절을 지어야 한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원통보전 일대에 굳이 건물을 세우려 한다면, 복원될 종이 있을 범종각 정도가 전부다. 그것이 진정한 복원이다.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생태도시’ 파주 교하지구 개발이 한창이다.
교하(交河)란 한강과 임진강 두 강이 교차한다는 뜻에서 나온 땅 이름이다. 교하는 광해군 당시(17세기 초) 조정과 온 나라를 몇 년간 시끄럽게 한 곳이었다. 또 1990년 초에는 풍수학자 최창조 교수가 통일 후 수도 후보지로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탄 곳이다.
1612년(광해군 4) 8월26일, 6품 벼슬 이의신(李懿信)이 한 장의 상소를 올린다. 상소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후 조정 대신들이 이의신을 반박하는 글 속에 그 편린이 조금씩 드러난다. 이를 모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과 역변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 조정의 관리들이 분당하는 것, 한양 도성 주변 산들이 벌거벗은 것, 이 모두가 도성의 왕기(旺氣)가 쇠퇴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도성을 교하현에 세워 순행(巡幸)을 해야 합니다. 교하 땅은 한양과 개성의 중간 지점으로서 동으로는 멀리 삼각산의 영산이 병풍같이 보이고, 북으로는 송악산이 웅장하게 서 있으며, 남으로는 옥야천리(沃野千里)가 기름지게 펼쳐 있어 오곡이 풍성하고, 서로는 한강이 넓게 흘러 배가 다니기에 좋은 땅입니다.”
산과 물이 얼싸안고 달리는 吉地

광해군은 이의신의 상소를 예조에 내려 의논토록 했다. 예조판서 이정구(李廷龜)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으로 혹세무민한다며 이의신의 처벌을 주장했다. 홍문관과 사간원도 지속적으로 이의신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애당초 이의신을 처벌할 생각이 없었다. 파문은 전국으로 번져갔다. 광해군 6년(1614)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이의신을 처벌하자는 상소 횟수가 100회를 넘었을 정도였다. 3일에 한 번꼴로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가 이어졌으니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결국 조정 중신들의 반대로 교하 천도는 이뤄지지 못한다.
17세기와 20세기 두 풍수학자가 도읍지로 언급한 교하는 과연 풍수적으로 그만한 땅일까? 당시 조정 대신들은 “교하는 하나의 작은 현(縣)인 데다 포구에 치우쳐 있어 성을 쌓고 부서를 만들기에 결코 적절한 곳이 아니다”라고 했고, 영의정 이덕형은 “교하는 습한 저지대로서 도읍을 세우기에 부적합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의신은 왜 이곳을 길지라고 했을까. 까닭이 없지 않다. 우선 교하현(현재 교하초등학교 자리)의 입지를 보면 한북정맥(漢北正脈)의 마지막 구간이 곡릉천과 만나는 곳이다. 의정부 사패산에서 시작한 산 능선은 도봉산→상장봉→노고산→국수봉→현달산→황룡산→장명산으로 끊길 듯 이어질 듯 평지를 내달리다가 교하현에서 멈춘다. 이른바 평지의 용으로 고양과 일산부터는 100m 안팎의 낮은 산들로 이어지지만 그 흐름이 유장(悠長)하며 생동적이다. 또 의정부 쪽에서 발원한 곡릉천은 앞의 산 능선과 지근거리에서 형제처럼 의좋게 흘러 교하초등학교 뒷산을 돌아 한강으로 들어간다(그림 참조). 산과 물이 몇십 리를 달리다가 마지막으로 교하초등학교 부근에서 서로 얼싸안으면서 교하읍 일대를 작은 명당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의신이 이곳을 길지로 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이 지적한 대로 작은 도시가 들어설 자리이지 도읍지의 크기는 아니었다.
교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호수’ ‘숲 속의 길’ ‘생태공원’ 등 인공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생태도시를 만들려면 교하초등학교에서 거꾸로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한북정맥의 마지막 부분과 곡릉천을 살려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군부대도 길을 약간 비켜주어야 하고, 도로로 잘린 산맥도 다시 이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산 능선과 물길을 따라 ‘교하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산국립공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북한산 짐승들도 물길과 산길 따라 교하 신도시로 놀러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친화적’ 도시가 아니라 ‘자연도시’가 된다. 교하는 지기(地氣)가 충만한 명당 도시가 될 것이다.

남풍 때때로 불 제 고향 생각하네/ 조상 무덤은 평안한지 일곱 형제는 무사한지/ 구름을 보며 고향 생각하고/ 봄풀을 봐도 고향 생각하는 마음 어느 땐들 없겠는가/ 일가친척은 살아 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하직했을까/(…).’
이 시를 쓴 시인의 원래 고향은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이 고향이라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일본의 지명과 형제의 이름이 무엇인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시인의 일본 이름이 사야가(沙也可)이지만 그것 역시 본명인지 확실하지 않다.
시인의 우리말 이름은 김충선(金忠善·1571~1642)이다. 시인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선조 임금이 김해 김씨라는 본관과 함께 하사한 것이다. 본래의 김해 김씨와 구별하기 위해 ‘우록(友鹿) 김씨’라고도 한다.
우록은 대구 근교에 있는 마을인데 일본인 사야가 장군이 김충선으로 이름을 바꾼 뒤 정착한 곳이다. 대구 시내에서 204(혹은 439)번 시내버스를 타면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종점에 도달한다. 우록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5년 11월 ‘김충선(사야가) 바로 알기 한·일 심포지엄’이 열린 뒤부터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다. 해마다 이곳 우록리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 지금은 일본어를 구사하는 안내인을 상주시킬 정도다.
임진왜란 때 참전했다 귀화 … 후손 5000여명 전국에 분포

사야가는 원래 시인이 아니라 장군이었다. 그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로 일본군 선봉장으로 조선에 왔다가 침략전쟁을 반대해 조선에 귀화한다. 그 후 조총과 화약 제조기술을 조선에 전수했을 뿐만 아니라 정유재란, 이괄의 난, 병자호란 등에서 큰 공을 세워 정이품 벼슬을 받는다. 김충선은 이곳에서 다섯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고 72세로 죽은 뒤 마을 뒷산에 안장된다. 현재 그의 후손 5000여명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록리에는 지금도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400여년을 지켜온 마을인 셈이다.
우록리와 김충선 묘의 입지를 풍수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나는 김충선의 택지관이 어떠했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나 이를 통해 그가 떠나온 일본의 고향이 어디였는지를 추측해보기 위함이다. 김충선은 죽을 때까지 일본의 고향 이름과 일곱 형님, 그리고 두고 온 2명의 아내에 대해서 함구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김충선의 고향과 후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조총과 화약 제조에 능했다는 점에서 혹시 이 기술이 발달한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이 아닐까 추측해보기도 하지만 역시 추측일 뿐이다(우록리에 거주하는 후손 김재덕 전 교장 선생님 증언). 대개 타국에서 터를 잡을 때 떠나온 고향과 분위기가 유사한 곳에 잡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그 당시 김충선은 조선 조정으로부터 경상도 이곳저곳의 땅을 하사받아 터 잡는 데 여유가 있었다.
우록마을을 지도에서 보면 왼쪽으로 우미산→통점령→주암산→가창면 소재지, 오른쪽으로 우미산→삼성산→병풍산→용지봉→가창면 소재지로 이어지는데 500~800m의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 우록마을에서 발원하는 물은 가창면 소재지를 지나 대구시를 관통하는 ‘신천’으로 이어진다. 첩첩 산들은 웅장하면서도 후덕하다. 난리를 피해 보신하기에 좋은 승지(勝地)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이 마을은 한 번도 전란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무덤 자리는 우록리의 압권(壓卷)이다. 삼정산(三頂山)에 있는데, 삼정산이란 문자 그대로 3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을 말한다. 무덤 자리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으나 맞은편에서 보면 3개 봉우리로 연결되는 삼각형의 중심점에 무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풍수에 ‘근삼원칠(近三遠七)’이란 말이 있다. ‘터를 볼 때 가까이서 세 번, 멀리서 일곱 번을 보라’는 뜻이다. 멀리서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찬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자리다.
이곳에 처음 터를 잡았던 김충선의 이와 같은 택지관을 참고한다면 앞으로 김충선에 대한 한일 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록마을을 찾는 한국과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런 ‘땅의 이치(地理)’를 알게 한다면, 현재 우록마을 진입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난개발을 막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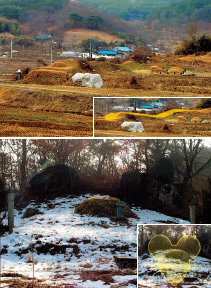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면장이라도 하려면 논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두렁 명당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된 적이 있다. 두렁이란 ‘논이나 밭의 가장자리로 작게 쌓은 둑이나 언덕’을 말한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러한 작은 두렁조차 땅기운이 흐르는 통로로 보아 매우 중시한다. 또 어느 지역의 생김새를 동물에 비유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랑이부터 쥐와 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큰 짐승으로 비유되는 땅은 덩치가 크고, 작은 짐승으로 비유되는 곳은 작고 좁다.
나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논두렁 명당’ 한 곳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풍수 호사가들이 자주 찾는다. 물론 당시는 풍수에 대해 알지 못하던 때여서 그곳이 ‘논두렁 명당’인 줄 몰랐다.
이 논두렁 명당은 내가 살던 마을에서 시오리쯤 떨어진 곳으로,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군 동계면 신흥마을에 있다.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주말이나 방학 때 버스를 타고 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마을 앞에 있는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에도 그 입지가 기이하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그 무덤 자리가 ‘사두혈(蛇頭穴.뱀 머리 형상과 같은 명당)’임을 알게 됐다. 또 뱀 머리에 돌을 올려놓으면 뱀이 머리를 쳐들 수 없듯, 뱀 머리 명당에 비석을 올리는 것을 꺼려 비석을 세우지 않거나 세우더라도 그 아래에 세운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
구불구불 논두렁 … 영락없는 새끼 뱀 모습
마을 뒷산으로부터 작은 산 능선 하나가 구불구불 내려오다가 논두렁이 되어 멈추었다. 뱀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다. 그런데 몸통이 매우 가늘어 새끼 뱀 같다. 새끼 뱀이 산에서 내려와 먹이를 찾는데, 온정신이 머리(혹은 눈)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지기(地氣)가 뭉쳤다고 한다. 바로 그곳에 무덤을 쓰면 발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두렁, 밭두렁은 뱀의 몸통이기 때문에 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독일문학’에서 ‘풍수지리’로 전공을 바꾼 이후 ‘풍수지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매 학기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사두혈이다. 학생들도 신기해한다.
1990년대 초, 화가 홍성담 선생에게 이 자리를 보여드렸다. 그는 “논두렁 명당으로 전국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고 평했다. 2000년 어느 봄날, 성균관대 조경학과 정기호 교수에게도 그곳을 보여드렸다. 그는 “새끼 뱀이 신기한 눈으로 세상을 구경하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풍수를 전혀 몰랐던 고등학생(필자)과 화가(홍성담), 조경학자(정기호)의 눈에 비친 논두렁 명당은 그 표현만 달랐지 느낌은 같았던 듯하다.
논두렁, 밭두렁이 단지 뱀 머리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순창 동계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임실군 오수면 내동 마을에 ‘늙은 쥐가 밭으로 내려온다’는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 명당이 있다. 밭두렁 명당인 셈이다. 같은 논두렁, 밭두렁인데 왜 이곳은 뱀 머리가 아니고 ‘늙은 쥐’라고 표현했을까?
‘늙은 쥐’라는 표현은 뱀보다 몸통은 굵으나 길이가 훨씬 짧은 데서 나온 것이다. 또 ‘산 능선의 변화가 뱀처럼 날렵하지 못하고 굼뜬 것’을 빗댄 것이다. 뱀과 달리 쥐는 두 귀가 쉽게 눈에 띄는데, 늙은 쥐로 표현되는 땅에는 두 귀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바위가 서 있어야 한다. 사진(아래)의 무덤 뒤에 서 있는 바위가 바로 귀를 상징하고, 무덤은 얼굴 부분에 쓰였다.
이렇듯 논두렁·밭두렁조차 땅의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 있는 짐승으로 인식되는 것이 풍수의 대지관(對地觀)이다. 땅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면 논두렁, 밭두렁 어느 곳 하나 함부로 자르거나 파헤치지 못할 것이다. 풍수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대지관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 1월에는 “퇴임 후 고향 동네인 진영이나 김해, 아니면 부산에 내려와 살겠다”며 좀더 구체적인 귀향 계획을 밝혀 고향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의 귀향’ 소식이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며 화젯거리가 된 것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퇴임 후 지역사회로 내려가 사회봉사를 하며 새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도 그 같은 귀향을 하겠다니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은 고향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 물론 성공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고향이 싫기 때문이다.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고향 땅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터가 그를 쫓아내, 성공을 한 뒤에도 그 땅과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귀향 마다하는 원인 중 하나는 ‘땅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
대통령들이 귀향하지 않는 까닭은 놓아버린 권력에 대한 미련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향 땅의 성격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몇 년 전 역대 대통령의 생가를 답사한 뒤 그 풍수적 특징을 월간 ‘신동아’에 기고한 적이 있다(2000년 10월호). 대통령들의 생가에는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 글을 인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집 바로 뒤로 산 능선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산 능선이 다하는 곳(山盡處)’이라고 하여 중요시한다.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산천의 정기는 산 능선을 따라 흐른다는 관념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태어날 때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터는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지 않고 변방에 있다는 점이다. 마을 전체에서 볼 때 마을을 감싸주는 테두리에 해당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테두리 지점은 심리적으로 울타리 구실을 하는 곳으로 동네 중심부와 외부세계의 경계에 있다. 한편으로는 동네 중심부를 부러워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스러운 눈으로 바깥세상을 넘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생가를 떠난 사람들’이 됐다. 고향에 대한 원초적 감정이나 추억이 결코 편안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땅과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노 대통령의 생가 역시 앞에 언급한 전직 대통령들의 생가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동네 좌청룡이 끝나는 지점에 있으며 그 옆에 바위로 된 봉화산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귀촌과 귀향을 이야기했다.
풍수에서 말하는 혈(穴)이란 사람(산 사람, 죽은 사람)이 거주할 곳을 말한다. 바로 그 혈을 찾아가는 과정과 행위가 풍수다. ‘존재의 고향’을 찾아가는 행위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자신을 밀어냈던 생가나 고향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산업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농촌을 찾겠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은 아름답다. 성공회대 신영복 교수는 자신의 책 ‘나무야 나무야’에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 맨 처음 느낀 것은 사람은 먼저 그 산천을 닮는다는 발견”이라고 했다.
고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고향을 떠났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자신이 고향 산천과 닮았다’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풍수에서는 땅 이름(지명) 살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지명에는 땅의 생김새나 특성, 성격 등이 반영된 것이 많아 지명을 통해서 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 산청(山淸)군 생초(生草)면은 ‘산이 높고 물이 맑아(山高水淸) 약초가 잘 자라는 곳(生草)’임을 암시한다. 실제 산청 일대에서 나는 약초는 효능이 좋기로 유명하다. ‘한방약초축제’ ‘산림약초추진단’ ‘산청약초마라톤대회’ ‘전통한방휴양단지’ 등 다양한 행사와 계획들이 이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땅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산청군이 한방과 약초를 브랜드 전략화한 것은 소설 ‘동의보감’과 TV 사극 ‘허준’이 유명해지고 나서부터였다. 평안도 용천 군수의 서자 허준이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경상도 산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 유의태와의 만남이다. 제자 허준을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 대상으로 내놓은 참스승의 모습에서 독자와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좋은 약초 찾아 생초면에 정착 … 살아서도 죽어서도 ‘칡’과 인연
허준을 통해서 스승 유의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고, 산청군은 위대한 두 명의 의사를 브랜드화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허준과 산청군은 아무 관련이 없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는 유의태다(김호 가톨릭대 교수의 글 및 유이태의 후손인 유철호 삼부시스템 대표 증언 참고).
소설과 사극에 등장하는 유의태의 실제 이름은 유이태(劉以泰). 그는 산청·함양·진주·남원·무주·전주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구비문학에 명의 유이태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홍역(마진)을 잘 다루어 아이들의 목숨을 많이 구했으며, 산부인과 병 또한 잘 다스렸다. 이렇게 영·호남 지역에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전해져 오는 까닭은 그가 뛰어난 의술을 가졌으며 환자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단방(單方) 위주의 처방을 했고, 당시 감기 치료에 널리 쓰던 승마갈근탕(升摩葛根湯)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주로 처방했다. 그야말로 소설과 사극 속에 등장하는 허준의 모습이다.
유이태의 본래 고향은 거창이었으나 산청군 생초면 신연마을로 옮겨와 의술을 펼친다. 그가 거창에서 생초로 옮긴 까닭은 효능이 뛰어난 약초와 물 때문이었다. 유이태가 남긴 ‘마진편’에는 “산청의 어느 절 스님들이 홍역에 걸렸는데 샘물을 반복해 마시게 하여 치료했다”는 글이 있다. 물을 통한 치료행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의술은 나중에 왕실에까지 알려져 1710년 한양으로 불려간다. 당시 임금인 숙종이 머리에 종기가 나 붓고 열이 가시지 않아 고생하는데도 어의들의 처방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유명 의사들을 불러 진찰하게 했는데 아산 현감 신우정(愼禹定), 안동의 박태초(朴泰初)와 함께 차출된 것이다. 이른바 재야 의사들 가운데 전국 3대 명의였던 셈이다. 이어서 1713년과 1715년에도 왕실에 불려가 숙종의 병을 치료했다. 1715년 그는 임금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말 한 마리를 하사받고 귀향하는데, 그 후 곧바로 사망한다.
죽어서는 경호강을 바라보는 생초면 갈전리 명주골에 안장되는데, 그가 생전에 즐겨 처방했던 승마갈근탕과 그가 안장된 지명 갈전(葛田), 즉 칡뿌리(葛根)와 칡밭(葛田)이 서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약초와 약수의 고장 산청군 생초면에서 활동하다 그가 영면의 장소로 택한 곳 역시 생전에 그가 즐겨 처방했던 칡뿌리가 많은 칡밭이었다.
독자들은 반문할 것이다. 허준의 생존연대(1539~1615)가 유이태(1651~1715)의 생존연대보다 훨씬 앞서는데 어떻게 허준의 스승이 된단 말인가? 소설과 사극에 묘사된 유의태는 실존인물 유이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가공의 인물일 뿐이다. 또한 민중의 의사로 묘사되는 허준의 모습 가운데 태반이 유이태에서 가져온 것이다.
산청군은 한방과 약초를 브랜드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산청과 전혀 관련이 없는 허준이 아니라, 실제 산청이 배출한 유이태를 브랜드화하는 것이 진정 ‘한방의 고장 산청’을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시사에 민감한 사람들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풍수 술사(혹은 풍수 호사가)다. 훌륭한 인물이 등장하면 기자보다 먼저 그 사람 주변으로 달려간다. 한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를 전세 내 집단으로 간다. 천하의 악인이 나타나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그 사람의 생가와 선영이다. 한 사람이 훌륭하게 됐거나 악인이 된 까닭을 생가나 조상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황 교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풍수 호사가들이 황 교수의 생가와 선영을 잇따라 방문했다. 방문객이 늘어나자 생가와 선영 근처에까지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관광버스를 대절해 황 교수 생가와 선영을 찾은 이들 대부분은 “이곳이 대명당임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이 반전돼 지난해 말 논문조작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수는 줄었지만 생가와 선영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졌다. 단지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을 뿐이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흉지임을 확인하고 간다”고 말한다. 또 이전에 다녀간 이들도 “그것 봐라, 내가 흉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가볍고 가벼운 것이 풍수라며 마을의 어느 분이 혀를 찬다(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 마을 어귀에 집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는 분의 증언).
황 교수 조부 묘 자리는 주변 산들이 잘 감싸고 맥도 제대로 받은 곳
나는 ‘황 교수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언론과 누리꾼, 그리고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월5일 일요일, 부여군 은산면 홍산2리를 찾았다. 천박하다는 조소를 무릅쓰고 다른 풍수 호사가들과 마찬가지로 생가와 선영을 보면 황 교수의 진실이나 미래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마을 사람들에게 생가와 선영의 위치를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랜 답사 경험 덕분에 생가와 선영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 말고도 10여명의 풍수 호사가가 승합차를 이용해 마을을 찾아왔다.
풍수에서 길흉화복을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가와 선영은 어떤 비중으로 살펴야 할까? 풍수의 고전 ‘황제택경(黃帝宅經)’에는 집과 무덤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묘지가 흉하고 집터가 좋으면 자손이 벼슬을 하고, 묘는 좋은데 집터가 흉하면 먹고사는 것이 부족하다.”
또 여러 조상 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좋은 자리도 있을 것이고 나쁜 자리도 있을 것이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조선시대 풍수지리학 고시과목 ‘호순신(胡舜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집집마다 고조(高祖), 증조(曾祖) 이하 여러 무덤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무덤의 좋고 나쁨이 상반될 것이다. 그 가운데 좋은 무덤을 본 사람은 그 집안이 길(吉)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쁜 무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여러 무덤을 가지고서 총괄하여 판단해야 한다. …촌수가 멀면 길흉화복이 완만하게 나타나며, 가깝고 친하면 길흉화복이 빠르게 나타난다.”
이런 풍수 원칙에 따라 황 교수의 생가와 아버지 묘, 할머니 묘, 할아버지 묘를 살펴본다면 어떻게 길흉화복을 말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았다. 엄밀하게 풍수설을 따라서 잡은 것은 아니나 할아버지 묘는 드물게 좋은 자리였다. 맥을 제대로 받았고, 주변의 산들이 잘 감싸고 있었다. 물길이 빠져나가는 수구는 조여 있었고, 흙색 또한 밝아서 좋았다. 새롭게 단장된 생가 역시 마을 뒷산에서 뻗어 내려온 중심 맥 위에 자리했으며, 청룡백호가 비교적 잘 감싸주고 있었다. 또 황 교수의 할머니 묘에서 바라본 앞산(朝山)은 붓과 같은 필봉(筆峯)으로 아름다웠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황 교수가 ‘학문의 사기꾼’이 되거나 불운을 당할 땅은 아니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마을을 돌고 있으니, 마을 어른 한 분(황동주·71)이 경계심과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뭐 하느냐고 묻는다. 답사 목적과 신분을 밝히자, “이미 우석(황 교수)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진데, 또 뭣 때문에!” 하고 화를 내신다. “진실이 밝혀지면, 나중에 모두 잘 되겠지요”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동네를 빠져나왔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문화&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시명의 체험여행 (0) | 2009.10.07 |
|---|---|
| 신정일의 역사와 사람들 (0) | 2009.10.03 |
| 강명관의 조선사회 뒷마당 (0) | 2009.10.01 |
| 조선의 비주류 인생_05 (0) | 2009.09.30 |
|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 (0) | 2009.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