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도적으로 만드는 자 누구인가
여인천하, 사도세자의 죽음, 그리고 강화도령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는 조선역사는 왕들의 역사요, 지배자의 역사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민(民)은 살아 있었고 묵묵히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民)의 생활사나
애환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신동아’는 지배 중심의 역사가 철저히 무시했지만 면면히 살아있었던 서민들의 삶과 문화를 발굴해보기로 했다. 강명관 교수는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이라는 책을 저술한, 조선시대의 문학과 예술, 서민의 삶에 관심이 많은 소장학자다.
조선사회의 이면사 그 첫회는 사회의 골칫거리였지만
백성들의 영웅이기도 했던 군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법은 절도를 금한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십계 중 일곱번째 계명이다. 고조선의 팔도금법에도 있다.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는다.” 절도가 용인되면, 즉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붕괴된다. 그러기에 절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사회적 금기다. 하지만 인간의 내부에는 절도에 대한 은밀한 욕망이 있다. 절도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먹이를 획득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생존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금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절도를 향한 욕망은 거침없이 드러난다.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그 야수적 욕망의 분출을 목도한 바 있다.
절도는 범죄지만, 인간은 한편으로 그 범죄를 합리화한다. 절도의 합리화는 부조리한 사회, 주로 재화의 분배에 있어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절도 행위자인 도둑을 찬미한다. 나는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축재와 부잣집 담장을 넘는 밤손님의 행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그 도둑이 넘었던 담장이 부정한 돈으로 쌓아올려진 것이라면, 월장(越墻)은 도리어 미화되고 찬양된다. 혹 그 도둑이 자신의 약탈물을 달동네에라도 던져주었다면, 그는 ‘의적(義賊)’으로 다시 태어난다. 급기야 그는 전설이 되고 소설이 되고, 가난한 우리는 일지매에 빠져들고 장길산에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도둑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다. 나는 조선시대의 도적에 대해 내가 아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조선시대 도둑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 경제사, 제도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한국사 연구의 여담에 해당한다. 물론 몇몇 진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논문으로 쓰여진 것이라 너무 딱딱하고 근엄하다. 나는 그런 엄숙함이 싫다. 좀더 편하게 접근하고, 기존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조선시대의 도둑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다. 혼자 활동하는 도적이 있는가 하면, 떼를 지어 다니는 군도(群盜)도 있다.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일시적으로 도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 말로 수백년 유구한 전통이 빛난다는 그런 도적 집단도 있다. 구복(口腹)을 위해 고민 끝에 도덕심을 눌러버리고 칼과 도끼를 들고 나서는 생계형 도적이 있는가 하면, 기성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각성한 도적도 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순진무구한 도적이 있는가 하면, 종적을 종잡을 수 없는 신출귀몰한 그런 도적이 있다.
어느 쪽도 재미가 있다. 하지만 도둑도 일종의 직업이니만큼 좀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형태가 좋지 않겠는가? 굳이 예를 들자면 일지매(一枝梅) 같은 경우다.
조수삼(趙秀三·1762~1849)은 자신의 독특한 저작 ‘추재기이(秋齋紀異)’에서 일지매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주 짧막한 것이기에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지매는 도둑 중의 협객이다. 매양 탐관오리들의 부정한 뇌물을 훔쳐 양생송사(養生送死)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처마와 처마 사이를 날고 벽에 붙어 날래기가 귀신이다. 도둑을 맞은 집은 어떤 도둑이 들었는지 모를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의 표지를 매화 한 가지 붉게 찍어 놓는다. 대개 혐의를 남에게 옮기지 않으려는 까닭이었다.
매화 한 가지 혈표(血標)를 찍어 놓고 / 부정의 재물 풀어 가난한 자 돕노라. / 때 못 만난 영웅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 오강(吳江) 옛적에 비단돛이 떠오놋다.
쪻오강의 비단돛이란 중국 삼국시대 감녕(甘寧)의 고사. 한때 적도(賊徒)로 횡행하여 오강에서 비단돛을 달고 다녔다 한다.”(이조한문단편선(중), 일지사, 1978, 339면)
일지매는 잡히지 않는다. 완벽하다. 게다가 매화꽃까지 남겨 남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 않는다니 멋있지 않은가? 나는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서보다 본 적도 없는 일지매의 붉은 매화에서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가 느껴진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가. 또 탐관오리의 부정한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니, 민중의 벗인 의적이다. 이런 도둑은 당연히 찬양의 대상이 된다. 조수삼은 그를 “때를 못 만난 영웅”이라고 하지 않은가.
일지매와 같은 유형의 도적으로 ‘아래적(我來賊)’이 있다. ‘어수신화(禦睡新話)’란 책에 있는 이야기다. 어떤 도적이 무엇을 훔치고 나면 반드시 ‘아래(我來·나 왔다 간다)’라는 두 글자를 적어놓았다고 한다. 하나 아래적은 일지매보다 한 등급 밑이다. 의적이 아닌데다가 포도청에 잡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뒤에 기지를 써서 탈출하지만 말이다.
일지매와 아래적은 혼자 활동하는 도둑이다. 그 건너편에 무리 도둑인 군도(群盜)가 있다. ‘모이면 도적이 되고 흩어지면 백성이 된다(聚則盜, 散則民)’는 말처럼 중세의 군도는 기본적으로 백성, 농민이다. 중세의 사회생산은 전적으로 농업생산이다. 농민이 농토를 떠나면 사회는 붕괴한다. 지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거룩한 이념(조선으로 치면 주자 성리학)을 내세워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지만, 그 이념의 속내는 매우 간단하다. 그 이념이란 지배층은 일하지 않고 농민만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비합리’를 ‘합리’로 분식(粉飾)한 어려운 말의 덩어리다.
물론 이념은 언제나 지배층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켜진 시대는 유사 이래 없었다. 지배하는 자들의 욕망은 언제나 차고 넘친다. 그리하여 지배층의 욕망이 농민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달리 말해 농민을 지나치게 쥐어짜면 농민은 토지를 떠난다. 지주의 토지 침탈, 과도한 세금 등으로 인한 농민의 토지 이탈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항시 일어나는 일이었다.
왕조의 건국 초기 짧은 안정기를 벗어나면 농민의 삶은 언제나 괴로웠다. 여기에 흉년과 전염병이란 구체적 계기가 발생하면 토지로부터의 유리(遊離)는 필연적이다. 토지를 떠난 농투성이들은 갈 곳이 없다. 떠돌다가 죽든지 아니면 다시 고향을 찾기 마련이다.
이와는 달리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가 있다. 도적이 되는 것이다. 유개(流쾬)와 군도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다. 18세기의 문인 이규상(李奎象)은 ‘우옹책(迂翁策)’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연래에 떠돌이 거지(流乞)들이 없는 때가 없었는데, 금년 가을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 허다한 떠돌이 거지들은 아마도 무리를 불러 모아 (도둑의) 근거지를 마련했을 것이다.”
이처럼 토지로부터 이탈한 유민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군도로 변하는 것이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했을 때 조직하는 군도의 형태도 퍽 다양하다. 영조17년 조문벽(趙文璧)이란 사람이 영춘역(迎春驛)으로 귀양을 가는데, 이유인 즉 그가 숙천군수(肅川郡守)로 있을 때 평안도의 극적(劇賊) 지용골(池龍骨)을 잡았다가 놓친 죄 때문이었다. 이해에 관동(關東)·관북(關北)·관서(關西)·해서(海西) 4도(道)에 기근이 들었고, 토지를 떠난 유민이 무리를 이루어 돌아다녔다. 서울에 있는 무리는 ‘후서강단(後西江團)’ 평양(平壤)에 있는 무리는 ‘폐사군단(廢四郡團)’ 재인(才人)이 조직한 무리는 ‘채단(彩團)’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무리는 ‘유단(流團)’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기회를 틈타 도둑이 되어 부고(府庫)를 습격해 탈취하였으나, 장리(將吏)가 체포할 수 없을 지경이었으므로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었으나 끝내 잡지를 못했다고 한다.(영조실록 17년 4월8일) 이 도적집단은 기근이라는 특정한 계기로 발생한 것이고, 또 그들의 출신지역이나 신분, 경제적 처지에 따라 각각 달리 집단화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습 도둑집단의 출현
대개 기근으로 발생하는 유민은 떠돌다 죽거나, 어렵게 살아남으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정한 근거지를 가진 세습적 도둑집단도 있다. 앞서 잠시 인용한 이규상의 ‘우옹책’은 도둑의 방지책을 서술한 것인데, 이 글에서 그가 든 근거지를 가진 세습적 도둑집단을 보자. 그가 지목하는 군도는 충청도 아산 근처의 한 큰 촌락이 근거지다. 다른 마을은 도둑이 침입해도 이 마을만은 안전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주민은 늘 호의호식을 하면서 지낸다. 근래 도둑을 맞은 촌락들도 대개 이 마을의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 마을 사람들이 절도와 관련되어 잡혀도 금방 풀려 나온다. 이규상은 이런 점들을 들어 이 마을이 도적촌이며, 철저히 추궁하면 도둑의 소굴을 소탕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우옹책’의 도둑촌은 군도의 한 가지 스타일일 뿐이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채가 있고 파수를 보는 그런 도둑집단과 다를 뿐이다. 실제 군도도 스타일이 여럿이라는 것만을 말해두려고 예를 들었던 것이다.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군도에 관한 것이다. 일지매 같은 멋이 넘치는 도둑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워낙 종적이 묘연하다. 자료가 없는 것이다. 소설을 쓰기 전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군도라면 다르다. 사료가 꽤 남아 있다. 이미 문학화된 군도 이야기도 많이 전한다. 홍길동·임꺽정·장길산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로, 소설로 유포되고 있다. 도둑도 홍·임·장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군도라야 역사적 중량감을 갖고 장편소설이 되는 것이다. 한국사학계에서 군도에 관한 연구물이 많지는 않지만, 읽어봄직한 것이 꽤 있다. 역사적 평가도 대체로 내려져 있다. 내가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할 것인가.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도의 내부조직에 관한 것이다. 이건 아직 별로 보고된 적이 없으니 이야기해봄직하지 않은가.
먼저 한문 단편 ‘홍길동 이후’라는 작품을 읽어보자. 원 출전은 ‘청구야담’이다.(번역은 ‘이조한문단편선(중)’에 실려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심진사가 별난 인물이다. 명문 사족이었으나 진사에 오르자 과거공부를 폐해버렸다. 누가 이유를 물으면 껄껄 웃고 말 뿐이었다. 과거공부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라니, 정말 호쾌한 사람 아닌가.
과거를 폐한 심진사의 유일한 취미는 말 타고 경쾌하게 달리는 것이었다. 답답한 세상 시원하게 달려보자는 심사였던가. 그는 귀족 고관 집에 좋은 말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타보기를 청했고, 또 말 주인들은 심진사의 명성을 이미 들었던 터라 선선히 말을 빌려주었다. 어느 날 심진사는 자기 집앞에 좋은 말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 한번 타보자 하니 허락을 하였고, 말에 올라타자 말은 한달음에 황해도 금천(金川)까지 달린다. 집에 돌아올 길이 막연한데, 또 어떤 이가 말을 타고 간다. 심진사가 타보자 했더니 허락을 하였고, 올라타자 말은 정말 지도에도 빠진 그런 심산유곡으로 냅다 달려간다. 도착해보니 도둑들의 산채가 아닌가. 도둑들은 말 두 필로 심진사를 ‘초빙’했던 것이다. 계략으로 심진사를 데려온 도적의 대표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홍길동의 후예”
“이 산채는 홍길동 대장으로부터 우금 백여 년을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역대 대장들이 모두 지모가 절륜한 분들이어서 군민이 안온히 지내왔습지요. 그러다가 작년에 와서 전의 대장께서 작고하시자 군무가 계통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방방곡곡에 대장으로 모실 만한 분을 물색하였는데 나으리보다 훌륭한 인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준마 한 필로 나으리를 금천까지 유치해서 다시 이곳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나으리께서는 특히 이곳 산채의 수많은 무리들을 사랑하시와 충의대장군의 인끈을 맡아주옵소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심진사는 쾌히 청을 받아들여 도적의 두령이 되고, 지략으로 해인사와 안동 호곡의 김진사, 함흥성을 털어 산채를 안정시킨 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 재미있는 군도담이다.
하지만 내가 정작 주목하는 것은 도적 입에서 나온 ‘홍길동 대장’ 이후로 백여 년을 내려왔다는 산채의 전통이다. 물론 허구일 것이다. 하지만 이 허구에는 모종의 역사적 내력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실천문학’ 통권 7호(1985년 여름호)에 ‘민중사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소설가 이문구의 글이 실려있다. 부제는 ‘김지하의 사상여행 제2회’다. 일종의 여행기다. 김지하와 함께 우리 땅에 서려 있는 민중사상의 저변을 찾아보자는 것이 기획의도인 듯하다. 7호의 여행을 함께 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분들이다. 천이두·송기숙·최창조·황석영·임진택·장선우·송기원 등이다. 여기에 주목해야 사람 둘이 더 있는데, 송명초·보원이란 스님 두 분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민중사상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두 분 스님네 입에서 흘러나온 ‘당취(黨聚)’의 존재에 마음이 비상하게 끌리는 것이다.
계룡산 갑사에 힘센 중이 많이 나와 그 기를 꺾으려고,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갑사를 중건하면서 절이 원래 있던 자리에 변소를 지었다는 보원 스님의 말에, 김지하는 힘센 중이라면 조선조 내내 산야에 출몰했던 당취, 즉 땡추들의 소굴이라도 됐단 말이냐고 묻는다. 이게 빌미가 되어 당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보원 스님 이야기의 골자를 추리면 대충 이런 내용이다. 땡추(黨聚)에는 금강산 땡추와 지리산 땡추의 양대 산맥이 있다. 이 양대 산맥이 형성된 시기를 보원 스님은 조선초로 잡고 있다. 조선 초 강력한 배불정책으로 불교의 종파들은 세종 연간에 선·교 양종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조계·천태·총남·화엄·자은·시흥·중신 등 7개 종파로 정리할 때 여기에 소속되기를 거부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버린 종파가 당취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리산 땡추는 선·교 양종의 통합에 순응했던 종파들 중에서도 조선의 불교정책에 대해 환멸을 느낀 나머지 금강산파에 통합을 희망했으나, 금강산파가 국책(國策)에 야합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따로 독립하여 지리산 당취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들 땡추는 반조선적, 즉 반체제적 조직이다. 보원 스님의 말을 들어보자.
“창업 이래 배불정책만 더욱 확실해지니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음을 미리 내다보고 전조(前朝)의 전철을 밟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왕권의 주변세력, 혹은 허울 좋은 호국불교 따위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에 따라 제도적인 종교정책을 무시하고 식읍적(食邑的)인 국토보다 중생의 불국토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일테면 재야불교(在野佛敎), 민중 속의 생활불교를 택했던 건데 이게 바로 금강산 땡추의 연원이에요.”
다음은 송명초 스님의 말이다.
“땡추는 백집 이백집 죙일 쏘댕기메 동냥해갖구 술집에 앉어 한입에 털어넣는 것이 땡춘디 … 그러나 이전 땡추덜은 억불정책에 대한 반항, 심에 밀려 산중으로 쫓긴 자긔덜 자신에 대한 반성, 신앙적 열정의 민중 보급로 두절 등 암울한 환경에 대한 저항으로 결국 반체제가 된 무리였이유. 그래서 객승 비젓허게 꾸미구서 때로는 산적패의 통신망두 되어 주구 때루는 항간에 떠돌메 민중교화에두 나스구 … 일종의 시대적 불교의 의붓자식덜이었슈.”

요약하자면, 당취는 조선체제를 부정하는 의식에 가진 자를 섬기는 귀족불교·호국불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재야불교를 추구하는 반체적 승려집단인 것이다. 물론 보원 스님의 말에 나오는 땡추의 행실은 외견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돌중, 스님에 대한 비칭인 땡추(땡초)에 가깝다. 또 땡추 혹은 땡초가 과연 당취란 단어의 음(音) 변화에서 온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일단 덮어두자.
그런데 군도 이야기를 한다면서 필자는 왜 뜬금없이 땡추를 들먹이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송명초 스님의 말 중에 땡추가 “산적패의 통신망도 되어주고”라는 부분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땡초=산적이란 등식은 아니지만 양자간에 일정한 연관이 있음을 내포하는 말이다. 보원 스님의 말이 여기에 약간 덧붙는데, 다음과 같다. 즉 땡초는 민중교화만이 아니라 민중구제까지도 겸업했다는 것인데, 그 민중구제의 수단이 바로 산적질이다. 산적과 결탁해서 낮에는 동냥하며 떠돌다가 관가와 토호들을 염탐하고, 밤에는 자기가 낮에 동냥한 것을 고을의 없는 사람들에게 풀어먹이곤 했다는 것이다. 땡추는 적어도 산적의 통신망이 되거나 아니면 산적질을 하기도 했던 그런 집단인 것이다. 우선 이 점을 염두에 두자.
조선 체제에 대한 저항조직의 하나로 송명초·보원스님이 전하는 당취의 존재는 너무나 흥미롭다. 그러나 두 분 스님네 말이 얼마나 정확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두 분 스님의 말씀 역시 전언에 의한 것일 테니 말이다. 보원 스님 자신도 “당취결사(黨聚結社) 자체가 비밀이었으니 문헌이 남아 있을 리 없고, 당취들도 그믐에 달지듯이 증빙을 두지 않았으니 ……”라며 스스로 문헌에 의한 증거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송명초 스님은 “시방 살아있는 최혜암 스님도 그 일당(당취의 일당)의 하나”였고, 청담 스님도 한 3년 따라다녔다고 증언한다. 이 모든 것이 산중의 전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혜암 스님 역시 송명초 스님이 이 말을 할 때 백세가 넘어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하고, 청담 스님도 열반하신 지 오래다. 이제 산중에서 더 상세한 전승이 남아 있을까 의문이다.
나는 공부하는 틈에 이 전승을 입증하는 문헌 증거가 혹시 나오지 않나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였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황성신문’에서 우연히 유관한 자료를 하나 찾게 되었다. ‘황성신문’ 1908년(융희 2년) 9월23일 자의 잡보에 ‘적단소탕(賊團剿蕩)’이란 기사가 그것이다. 내용은 경시청(警視廳)에서 2월7일부터 6월까지 화적당(火賊黨) 86명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도둑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의 화적을 하나씩 잡아들인 결과다. 이어 9월25, 26일 양일간에 ‘적단(賊團)의 전말(顚末)’이란 기사가 실리는데, 여기에 화적단의 조직에 관한 언급이 있다. 먼저 씨앗이 될 만한 이야기부터 인용한다. 현대어로 약간 풀어 쓰면 이렇다.
“경시청 신문계(訊問係) 순사부장(巡査部長) 삼육치(森六治)씨가 우리나라 화적의 뿌리를 상세히 알아내는 데 종사한 지 5, 6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2월7일 오후 3시에 중부(中部) 전동(典洞)에 사는 안만수(安晩洙)씨의 별실(別室) 생일에 강도 7명이 돌입하여 재산을 약탈한 일을 쫓다가 같은 달 28일에 남문 밖 동막(東幕) 객주(客主) 홍재현(洪在鉉)의 집에서 승도(僧徒) 송학(松鶴)과 같은 무리 20여 명을 체포하였다.”
왜 일본인 순사냐 하면 이때는 벌써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통감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요는 안만수란 사람 첩의 생일에 강도 7명이 돌입해 재산을 털었던 바, 일본인 순사의 추적 끝에 같은 무리 20명을 체포했다는 것이다.
삼육치는 계속 추궁하였으나 도적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고문을 가했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럼에도 함구로 일관하자 작전을 바꾼다. 순사부장 가납무평(加納武平)이 송학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옷을 벗어 입히고, 먹을 것을 시켜 먹이는 등 ‘인간적인’ 대우를 한다. 송학은 감동하여 입을 연다. 달리 말해 송학은 설렁탕 한 그릇에 동료를 판 것이다. 그의 배반으로 86명의 동료가 잡혔다. 어디서 많이 보던 수법이 아닌가. 송학이 설렁탕 한 그릇에 털어놓은 것이 무엇인가. 화적단의 조직이다. 이건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황성신문’이 지면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화적단의 조직은 내사(內社)와 외사(外社)로 나뉜다. 송학의 말에 따르면 내사는 “거금 500년 전에 강학(强虐)이 무쌍한 승려 홍길동이란 자가 5772명의 부하를 이끌고 의적이고 한 것”이 그 시초라 한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5772명의 부하란 것도 과장된 것이려니와, 실제 홍길동이 활동한 것도 1500년경이니 연도도 맞지 않다. 하기야 이런 자료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송학을 타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 조직이 오래되었을 가능성은 실제 있다. 내사는 모두 홍길동의 제자라 칭하고, 홍길동을 떠받들어 선생이라고 불러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본 한문 단편 ‘홍길동 이후’에서 도둑들이 심진사에게 자신들 산채의 유래를 홍길동 장군으로부터 100년을 내려왔다고 하고 있으니, 군도는 실제 조선조부터 홍길동의 후예임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의 강점은 내사를 당취와 관련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내사는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다. 송학의 증언에 의하면, 승려 중에서 친자식에게도 자신이 내사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관헌에게 체포되어도 내사의 비밀을 토설(吐說)하지 않을 ‘정신이 강고(强固)’한 승려를 가려 뽑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500년 동안 내사의 존재를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사실, 즉 내사가 승려를 단원으로 뽑고, 대단히 강고한 내적 결속력과 비밀을 수호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당취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고 내사=당취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섣불리 말하고 싶지는 않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보원·송명초 스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 곧 신빙성이 높은 전승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 개인적 견해는 내사=당취의 상동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외사의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내사의 승려가 환속하여 역시 강도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사에서 그 조직의 발각을 우려하여 이들을 늘 엄중히 감시한다. 그러나 내사원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해지기도 한다. 이때 환속한 내사원이 내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속인으로서 화적단을 조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외사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속인 출신의 저명한 강도가 외사에 가입하기도 해 적단의 구성원이 복잡해지게 된다. 외사의 기원 역시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른다.
‘황성신문’의 자료는 아쉽게도 여기서 끝난다. 좀더 많이, 소상히 기록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거의 같은 시기의 자료가 남아 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독립운동사의 사료가 되는 저작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구한말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회사 자료이기도 하다. 이중에 조선시대 군도의 조직이 소개되어 있어 더할 수 없이 고맙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신민회(新民會)가 결성되자 백범 역시 참여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듬해 1월5일 일제 헌병대에게 체포돼 징역17년을 언도받고 서대문 감옥소로 이감된다. 백범은 이때 삼남 불한당의 괴수 김진사로부터 조선 전래의 ‘계통 있는’ 다시 말해 역사적 유래가 있는 도적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이하, ‘백범일지’는 도진순이 주해한 2002년 발행, 돌베개판에 의한다.)
김구 역시 양산학교 사무실에서 여러 교사들과 함께 지낼 때 이른바 활빈당이니 불한당이니 하는 비밀결사가 마을이나 읍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하던 것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활빈당과 불한당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 식으로 민활하였기에 관에서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언젠가 독립운동에 필요한 견고한 조직과 민활한 훈련을 위해 그들의 결사와 훈련을 몇 달 동안 연구하였으나 소득 없이 실패하였다. 김구가 양산학교에 있었던 것은 1909년이다.
강재언의 연구(활빈당 투쟁과 그 사상, ‘근대조선의 민중운동’, 풀빛, 1982)에 의하면 활빈당은 1899년부터 1904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활빈당이란 이름이 나온 문헌을 증거로 삼았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김진사의 자료는 앞의 ‘황성신문’의 자료와 불과 3년 정도의 차이가 나니,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도둑의 조직과 관습을 추적해보자. 먼저 김진사의 말을 인용한다.
“조선시대 이전은 상고할 수 없으나, 조선시대 이후 도적의 계파와 시원은 이렇습니다. 도적이란 이름부터 명예스럽지 않거든 누가 도적질을 좋은 직업으로 알고 행할 자 있으리오만, 대개가 불평자의 반동적 심리에서 기인된 것이외다. 고려말 이성계가 신하로서 임금을 쳐서(以臣伐君) 나라를 얻은 후, 당시에 두문동(杜門洞) 72현 같은 사람들 외에도 고려 왕조에 충성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많았을 것이오.
양대 도적 목단설과 추설
그러한 지사들이 비밀리에 연락 혹은 집단하여 가지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기운 것을 붙들고자(濟弱扶傾) 하는 선의와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보복적 대의를 표방하고 구석진 곳에 동지를 소집하였습니다. 조선의 은총과 국록을 먹는 자, 백성을 착취하는 소위 양반이라는 족속과 부유한 자의 재물을 탈취하여 빈한한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나라에서 도적이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500여 년 동안 압박·도살하여 온 것이외다.”
김진사는 두문동 72현 같은 반체제 세력을 군도의 시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원 스님의 말과 아주 흡사하다. 보원 스님은 “땡추들이 힘을 모으게 된 것은 불국토의 현실화에 대한 열망 못지않게 고려 유민의 망국한이 조선조의 저변을 흐른 까닭”이라며 고려 유민의 망국한을 들고 있지 않은가. 고려 유민과 군도는 어떤 식으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김진사는 불교와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따지기로 하고, 김진사의 말을 더 들어보자.
김진사가 전하는 군도의 조직은 이렇다. 강원도에 근거를 가진 도적을 ‘목단설’이라 하고, 삼남 즉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도적을 ‘추설’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북대’라는 것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이 임시로 작당하여 민가나 털고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목단설과 추설의 도당은 서로 만나면 초면이라도 동지로 인정하고 서로 돕지만, 북대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적대시하는 규율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사형(死刑)에 처했다고 한다.
추설과 목단설, 그리고 북대는 송학이 실토한 내사·외사와 일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추설과 목단설을 승려를 중심으로 한 도적 조직으로 본다면, 이것은 송학의 내사에 해당하고, 북대는 외사에 해당한다. 물론 송학이 말한 외사는 원래 내사의 구성원이었다가 떨어져나온 자와 민간인 출신의 강도가 결합한 형태를 띠는 것이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한데 목단설·추설이 북대를 적대시하여 만나면 무조건 죽인다는 과도한 적개심은 아마도 그들의 조직에서 떨어져나간 존재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추설과 목단설은 앞의 보원·송명초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목단설은 강원도에 근거를 가진 도당이고, 추설은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도당이다. 지리산은 알다시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걸쳐 있으니, 보원 스님의 말과 일치한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도적단에 승려가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 또 그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추설·목단설이 승려로 조직된 것인데 반해, 김진사의 군도조직은 승려에 관한 말이 없다.
군도의 소굴이 된 사찰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연결시킬 꼬투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김진사는 추설과 목단설이 1년에 한 번 내부의 공사(公事)를 처리할 때 반드시 큰 시장이나 사찰에서 모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사찰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또 김진사의 지휘로 하동(河東) 화개장(花開場)을 털었을 때 쌍계사에서 장물을 분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하동 화개장과 쌍계사는 지척지간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쌍계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이 아닌가.
이곳은 원래 군도의 소굴이거나 아니면 군도세력과 협력의 관계에 있는 사찰임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어렴풋이나마 김진사가 추설(그는 원래 삼남의 ‘불한당’이었다)이고,
곧 지리산계의 땡추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찰과 군도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숙종실록’의 자료를 들 수 있다.
“대저 불가(佛家)의 학설은 사람의 심술(心術)을 무너뜨리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서 유인하여 사찰(寺刹)이 팔도에 두루 차 있습니다. 양민(良民)의 아들이 군역(軍役)을 피하려고 꾀하여 다투어 모두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고, 흉년에 이르러서는 또 도둑 소굴이 됩니다.”(숙종실록 23년 5월18일, 이유제(李惟濟)의 상소)
양민이 군역을 피해 승려가 되고, 흉년이 들면 군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구한말에도 볼 수 있다.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청사(續陰晴史)’(광무 4년 10월 조)에 의하면, 활빈당이라 칭하는 양남(호남·영남)의 군도가 경주의 운문사, 양산의 통도사를 근거지로 삼고, 10명에서 100명씩 무리를 이루어 부민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곧 경주 운문사, 양산 통도사가 활빈당의 소굴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백범일지’의 김진사의 조직이나 아니면 당취 조직과 어떤 구체적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찰과 평소의 모종의 협조적 관계가 없으면 사찰이 군도의 근거지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소설 ‘장길산’으로 유명해진 사건을 들어보자. 숙종23년 승려 부운(浮雲)이란 자가 승려 수십명을 각도의 사찰에 파견하여 거병범궐(擧兵犯闕)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다.(정석종 교수의 숙종 연간 승려세력의 거사계획과 장길산,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1983)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가 매우 흥미롭다. 첫째는 이들이 고려조의 충신인 정몽주나 최영의 후손에게서 새 왕조의 왕을 뽑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땡추나 추설·목단설의 고려에 대한 충성 의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숙종시대의 대적(大賊) 장길산 부대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승려 세력이 군도와 긴밀히 연통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땡추와 추설·목단설의 상관성은 이들이 단순한 생계형 도적이 아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보원 스님은 “땡추들의 명분과 과제는 단연 현실 개혁적이었으며 혁명사상의 성취”라 하였다.
김진사의 도당 역시 그런 체제 저항적 요소가 충만하다. 김진사는 백범에게 백범의 출신지가 황해도임을 상기시키면서 황해도 청단(靑丹) 장을 치고 곡산(谷山)군수를 죽인 사건을 자신이 영솔하여 한 일이라고 말한다. 양반의 행차로 가장하여 사인교를 타고 구종 별배를 늘어세우고 시장을 턴 뒤 질풍뇌우처럼 곡산군아를 습격하여 인민을 ‘짓밟아 어육(魚肉)’으로 만든 군수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땡추처럼 체제 저항적인 의적의 이미지가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도둑들의 입당식

이제 군도의 조직 내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장 큰 우두머리가 별유사(別有司), 별유사를 보조하는 자가 부유사(副有司)다. 이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영감(令監) 제반 사항을 지휘함
중년(中年) 유사 영감의 지휘에 따라 활동하는 자
만사(萬事) 회계 사무
종도(宗徒) 졸병
별유사는 내사 조직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도둑들의 민주화!). 그외는 별유사가 추천한다. 다만 사중(社中)에 서류가 없어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
목단설과 추설의 내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각 설의 최고 수령을 ‘노사장(老師丈)’이라 한다. 이것은 내사의 별유사와 같은 것이다. 그 아래의 총사무를 유사(有司)라고 한다. 내사의 부유사나 영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목단설·추설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이것이 내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따라서 미상이다. 특기할 것은 목단설·추설은 지방의 하부 조직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지방의 책임자가 있으니, 이들도 유사라고 부른다.
목단설·추설의 조직원은 이렇게 선발된다. 각 설의 도당은 소수정예주의다. 각 설의 노사장은 1년에 각 분(分)설에 자격자 1명을 정밀하게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자격자가 되는 조건은 첫째 눈빛이 굳세고 맑을 것, 둘째 아래(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맑고, 셋째 담력이 강실(强實)할 것, 넷째 성품이 침착할 것 등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 보고하면, 설의 지도부에서 비밀리에 조사하여 그 합격자를 도적으로 만든다.
노사장의 명령에 의해 책임 유사는 자격자에 접근한다. 자격자의 기호 술·미색·재물 등으로 극진히 환대하여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워진 뒤 어느 날 밤이 깊어진 뒤 어떤 집 문전에서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사라진다. 이내 포교로 변장한 자가 자격자를 포박하여 70여 가지의 악형을 가하며 도둑으로 모는데, 스스로 도둑이라고 실토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끝내 아니라고 고집하면 결박을 풀고 따로 은밀한 장소에서 술과 고기를 먹인 뒤 입당식을 거행한다. 입당식 장면이 재미있다. 김진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
“입당식에는 책임 유사가 정석(正席)에 앉고, 자격자를 앞에 꿇어앉히고 입을 벌리라 한 뒤 칼을 빼 그 끝을 입안에 집어넣고, 자격자에게 ‘위 아래 이빨로 칼 끝을 힘껏 물라’ 호령합니다. 그리고 칼을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네가 하늘을 쳐다보아라. 땅을 내려다보아라. 나를 보아라’ 호령한 뒤, 다시 칼을 입 안에서 빼 칼집에 넣고 자격자에게 ‘너는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사람을 안즉 확실히 우리의 동지로 인정한다’라고 선고합니다.”
이렇게 신고식이 끝나면 정식으로 강도질을 한 차례 하고 장물을 분배해준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강도질에 동행하면 완전한 도적이 되는 것이다.
도적단은 어떤 방식으로 기율을 유지했는가. 김진사의 말에 의하면 4대 사형죄가 있다고 한다. 첫째 동지의 처첩과 간통한 자, 둘째 체포·신문 때에 자기 동료를 실토한 자, 셋째 도적질할 때 장물을 은닉한 자, 넷째 동료의 재물을 강탈한 자다. 이들은 발각되면 사형이다. 이들의 법은 극히 엄하여 포교를 피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도 도적의 법에 사형을 선고받고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고 한다. 만약 도적질이 하기 싫다든지 늙어서 도적단에서 빠지고 싶다고 청원을 해도 동지가 위급한 경우 자신의 집에 숨기를 요구할 경우 이 한가지만은 반드시 응한다는 서약을 받고 행락(行樂·도적질)을 면제해준다.
잔혹한 배신자 처단의식
이들이 수백년의 조직을 유지해온 것은 엄격한 내부 단속과 함께 외부의 권력기관과 연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각 설은 사환계(仕宦界·관계)에, 특히 포도청과 군대에 요직을 갖고 있다. 도적이 어떤 도에서 잡힌 뒤 그가 북대이면 지방 관청에서 처결하고, 설이면 서울로 압송하게 한다. 만약 도당을 털어놓으면 사형하게 하고, 자기 사실만 공술하면 기어코 살려 옷이나 음식을 공급하고 뒤에 출옥시킨다.
이상이 현재 도적의 입당식에 관한 유일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보원 스님의 말에도 땡추의 입당식에 관한 것은 전혀 없다. 대신 보원 스님은 땡추의 조직에 대해서 심진사보다 훨씬 더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땡추의 법을 어긴 자를 정죄하는 참회법이란 것이 있는데, 실정법을 초월한 제도로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지리산계보다 금강산계가 더욱 엄격했다는 것이다. 지리산계는 당류(黨類)가 금기를 범했을 경우 신체에서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굴절시키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도벽이 있을 경우 손목을 자르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금강산계에서는 아량을 베풀어 범법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든가 그대로 타살을 강행하여 당류뿐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한다. 이문구는 보원 스님의 말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요약해보자.
갑이라는 당원이 파계를 범하면, 그것을 안 최초의 땡추는 여러 곳에 기별하여 사람을 모은다. 성원이 되면 재판이 열리는데, 만약 유죄 쪽으로 기울면 갑을 잡으러 두 사람이 떠난다. 편의상 두 사람을 을과 병이라 하자. 갑이 있는 절을 찾아가서 갑에게 접근하여 갑에게 세숫물, 빨래, 청소 마른 일, 진 일, 심지어 발 씻을 물까지 대령하는 등 무상(無償)의 봉사를 하여 갑의 환심을 산다. 을과 병은 서로 모른 체한다.
셋이 친숙해지면, 을과 병은 금강산 여행을 가자고 갑을 꾄다. 갑과 을이 금강산으로 떠나면 병은 각처의 땡추들에게 통문을 띄운다. 땡추들은 우연히 갑과 만나는 것처럼 한둘씩 시간을 두고 갑과 일행이 된다. 마침내 원래 정했던 장소에 도달한다. 이때까지 갑은 전혀 사정을 모른다. 갑을 처단하는 의식이 집행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처형의 방식이란 이렇다.
땡추의 일행 중에서 미리 돼지고기를 준비해온 사람이 돼지고기를 내놓으면서 “스님 원로에 공양이 부실하여 속이 허하실 텐데, 여기 성계육이나 좀 맛보시지요” 하면 갑은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된다. 갑이 살아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갑이 선승이라면 선문답을 통해서, 갑이 강백(講伯)이라면 ‘금강경’이나 ‘화엄경’ 등에 대한 물음을 통해 땡추들의 입을 다물게 할 능력과 품위가 있으면 용서받을 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죽음이다.
“너는 양민의 피땀에 영글은 시주밥과 그들의 한숨이 날줄과 씨줄을 낳은 옷에 살이 찌고도 스스로 근본을 저버렸으니, 그로써 혜명(慧命)을 모독한 죄는 실로 하늘을 덮고도 남는다. 하물며 이승에 목숨을 붙여 백성들의 고달픔에 덤이 되게 할 것이랴. 마땅히 너로 하여금 오늘로써 이승의 자취를 거두게 함이 법당의 크나큰 자비로다.…”
이런 말을 마친 땡추들은 갑을 층암절벽으로 밀어넣거나 구덩이에 산 채로 묻는다. 세상과 영원히 하직시키는 것이다. 이런 잔혹스러울 정도로 내부 조직을 다졌기에 그들의 말대로 수백년을 전해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도의 일이 도둑질이니 이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군도의 활동에 대한 자료는 조선시대의 관찬사료에 풍성하게 남아 있다. 우선 군도의 규모를 보자. 임형택 교수에 의하면, 성종 말년인 1489년 김막동 부대가 평안도를 중심으로 7년간 활동했고, 1500년경 홍길동이 경기·충청과 경상 북부에 걸치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1530년경 순석(順石) 부대가 전라·충청·경기 삼도에 걸쳐 투쟁했는데, 일당 39명이 관군에게 붙잡힌 뒤 연루되어 체포된 사람이 170여 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한 규모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임꺽정 부대가 출현한다.
이건 조선전기의 기록이다. 조선후기에는 군도에 대한 보고가 더 많아지고, 내용도 상세해진다. 영조28년 3월 비변사에서 보고한 김포에 침입했던 명화적을 예로 들어보자.
“김포군의 명화적(明火賊) 수백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서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군(本郡)에서 감영(監營)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중(尹得中)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오고 감사(監司) 및 토포사(討捕使)는 중추(重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해 잡도록 해야겠습니다.”(영조실록 28년 8월 3일)
명화적이 수백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또 영조41년에 조정에 보고된 군도의 조직원은 약 300~400 명이었다고 한다. (영조실록 41년 12월 27일) 조선후기의 군도는 수백명 단위로 조직되는 경우가 허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화적이 말을 타고 포를 쏜다고 한 것도 주목거리다. 포는 총을 말한다. 즉 기동성이 높은 말과 총으로 무장한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로 무장한 조직을 움직이려면 당연히 엄격한 위계와 결속력을 갖지 않고는 안된다. 이쯤 되면 지방 관아 습격은 일도 아니다. 조선후기의 관찬사료에 지방 관청을 군도가 공공연히 공격하였음에도 지방관이 변변히 저항도 못하였다는 숱한 기록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위에 예시한 내용이 도적의 외부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흠이 있다. 이런 점에서 ‘백범일지’의 김진사의 자료는 도적 스스로 공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설이 조직원을 모두 불러모으는 것을 ‘장 부른다’고 하는데, 만약 목단설과 추설이 공동으로 장을 부를 경우 ‘큰 장 부른다’고 한다. 각 설이 단독으로 조직원을 불러모으면 그냥 ‘장 부른다’고 한다.
큰 장을 부르는 것은 원래 설의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에 큰 시위 삼아 도적질을 한 차례 한다고 한다. 큰 장을 부르는 통지에 도 각 지방 책임자에게 부하 누구누구 몇 명을 파송하라 하면 어김없이 시행되는데, 흔히 큰 시장이나 사찰로 부른다.
이때 각지의 도둑들이 모이는데, 모두 형형색색으로 변장을 한다. 돌림장수로, 중으로, 상제로, 양반 행차로, 등짐장수 따위로 말이다. 김진사는 그 일례로 하동 화개장을 친 일을 들고 있는데, 흥미진진하기 짝이 없다.
화개장은 유행가 가사처럼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 속에 도둑들이 섞인다. 중장(中場)이 되면 상여를 비단으로 꾸민 호사스런 행상(行喪)이 장에 들어서는데, 상주가 삼형제고 뒤에 복상제와 호상하는 사람들도 많다. 상여를 큰 술집 앞에 내려놓고 상주들이 곡을 한다. 상여꾼들은 술을 먹는다.
이때 호상객 한 명이 ‘갯국’ 즉 요즘말로 ‘보신탕’이요, 예전말로는 ‘개장’ ‘개장국’을 사서 상주에게 권한다. 상주에게 개장국이라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망발 중의 망발이다. 하지만 근신중인 상주가 아닌가. 온건한 말로 거절한다.
“무슨 희롱을 하다못해 상제에게 갯국을 권하는가. 그리 말라.”
호상객은 들은 척도 않고 계속 권한다. 그리하여 상주와 일대 전쟁이 벌어진다.
“아무리 무식한 놈이기로 초상난 상제에게 갯국을 먹으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친구가 권하는 갯국을 좀 먹으면 못쓰느냐?”
다른 호상인들도 싸움을 말리느라고 야단을 치고, 이래서 장터의 장꾼들은 모두 싸움판에 집중되고 웃음이 낭자해진다. 이때 상주가 죽장을 들어 상여를 부수고 널판을 깨어 널의 뚜껑을 잡아 제치면, 시체는 없고 오연발 장총이 가득하다. 이때는 이미 총이 상용화된 때라 오연발 장총이다. 상주·호상꾼·상여꾼들이 총 한 자루씩 들고 사방 길목을 지키고 시장에 놓인 돈과 집에 쌓아둔 부상(富商)의 돈을 모두 탈취한다. 쌍계사에서 분배하였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바탕의 도적질은 이렇게 끝난다. 김진사의 말에 의하면 계통 있는 도적들은 도둑질을 자주 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차례다. 장물을 나누는 것도 예로부터 정한 규칙에 의해서 한다. 백 분의 몇은 노사장에게로, 그 다음 각 지방의 공용, 몇 분은 조난당한 유족의 구제비, 이렇게 몇 분을 제한 후 극단의 모험을 감수한 자에게 장려금까지 주고 나서 평균 분배한다. 따라서 장물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진사는 옛날에는 해마다 큰 장을 한 번씩 불렀으나, 이 시기에는 재알이(왜놈)가 하도 심하게 구는 탓에 폐지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경찰력이 아마도 군도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자 군도는 서서히 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양산박의 군도를 그린 ‘수호전’은 지금도 읽힌다. 영화로 비디오로도 가공된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에 이미 소설화되었으며, ‘임꺽정’은 일제시대에, ‘장길산’은 해방 이후에 모두 소설화되었다. 소설이 아닌 실제의 홍길동과 임꺽정, 장길산이 과연 의적이었을까. 그들은 과연 탐관오리만을 제거하는 그런 도둑이었던가. 사료를 보건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것으로 남는다. 부정직한 체제, 지배자에 대한 저항만으로도 그들은 아름답게 기억된다. 도둑을 영웅시하는 사회는 어딘가 곪아 있는 병든 사회다. 병든 체제에 대한 저항이 군도가 형성한 이미지인 것이다.
임꺽정 부대가 활동했을 때 사신은 ‘실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 도적이 생긴 것은, 도적질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기한(飢寒)이 절박하여 부득이 도적이 되어 하루라도 연명(延命)하려고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권세가의 문전이 시장을 이루어 공공연히 벼슬을 팔아, 무뢰한 자제들을 주군(州郡)에 나열(羅列)하여 백성들을 약탈하게 하니 백성이 어디로 간들 도적이 되지 않겠는가.”(명종실록 16년 10월 17일)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을 두고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도 못하는 짓이 없는” 대도(大盜)로 지적하고 있다.(명종실록 16년 1월3일) 조정에 있는 권세가가 대도란다. 뭐 생각나는 것 없는가. 신문이며 방송에 나날이 나는 소식을 보니, 과거 군도가 설치던 시대와 지금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 같다. 땡추와 김진사가 사뭇 그립다.
검계(劍契)와 왈자(曰字)로 불리던 문제집단이 그들.
군사조직에 가까운 조직과 규율을 갖췄던 검계, 사실상 기방의 운영자였던 왈자. 이들 때문에 조선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물론 조용한 아침 운운 탓은 아니지만, 역사가들이 그려낸 한국사에서 인간들이 북적대며 살아가는 정경을 상상하기는 실로 어렵다. 어딘가 조용하다. 뭔가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왕실과 사대부에서다. 권력을 두고 죽고 죽였으니 그들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곡소리가 났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만 늘 TV연속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리라.
역사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역사는 묘사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그려지기 마련이다. 활기찬 역사를 그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그려질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조선의 깡패에 해당하는 인간 부류를 묘사해 보려고 한다. 양반님네들이 장죽을 물고 느릿느릿 팔자걸음을 걷는 점잖은 조선시대에 웬 깡패인가.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은 시대를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으랴? 먼저 숙종 때의 기록을 보자.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도하(都下)의 무뢰배(無賴輩)가 검계(劍契)를 만들어 사사로이 서로 습진(習陣)합니다. 여리(閭里)가 때문에 더욱 소요하여 장래 대처하기 어려운 걱정이 외구(外寇)보다 심할 듯하니, 포청(捕廳)을 시켜 정탐하여 잡아서 원배(遠配)하거나 효시(梟示)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신여철(申汝哲)에게 명하여 각별히 살펴 잡게 하였다(숙종실록 10년 2월12일).
서울 시내의 무뢰배가 결성한 검계(劍契)가 습진을 하여 서울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니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습진이란 진법을 익히는 훈련이다. 군사훈련인 것이다. 정식 군사가 아닌 무뢰배의 조직이 군사훈련을 하니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 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이 시기 민간인이 불안해할 만한 정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 기록에 등장하는 문제의 검계란 무엇인가? 검계에 관해서는 이 자료와 연속된 숙종실록의 자료가 셋이 더 있다. 관변의 공식 자료가 아닌 것으로는 ‘조야회통(朝野會通)’이 있고, 이것이 ‘연려실기술’에 다시 인용되어 있다. 또 하나는 홍명희가 인용한 ‘화해휘편(華海彙編)’에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자해는 조폭문화
좌의정의 보고가 있고 난 뒤 임금의 명으로 포도청에서 검계의 도당을 체포한다. 그 결과를 2월18일 다시 민정중이 보고하는데, 포도청에 갇힌 검계 도당 10여 명 가운데 ‘가장 패악(悖惡)한 자’는 칼로 살을 깎고 가슴을 베기까지 하는 등 그지없이 흉악한 짓을 한다. 자해는 아마도 조폭문화(?)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데, 예컨대 영화 ‘투캅스’에서 조서를 받던 깡패가 자해소동을 벌이는 것을 상기해 보라. 민정중은 느슨히 다스릴 경우 그 무리가 불어날 것이고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두머리는 중법(重法)으로 처결하고, 붙좇은 무리는 차등을 두어 처벌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민정중은 2월25일 다시 검계에 대해 보고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검계는 원래 향도계(香徒契)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향도계란 장례를 치르기 위한 계를 말한다. 장례에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계를 구성하여 평소 얼마간의 금전을 염출하고, 구성원 중에 누가 상을 당했을 경우 평소 염출한 금전에 얼마를 더하여 비용을 마련해 주는 그런 계였을 것이다. 이 계는 원래 한국민의 독특한 풍습인 계와 다를 것이 없다. 민정중의 보고에 의하면 이 계는 서울 시내 백성들, 즉 일반 민중들 것이었으며 사대부가나 궁가에서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과 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민정중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무리를 모을 때에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한 것을 묻지 않고 다 거두어 들였으므로, 여느 때에는 형세에 의지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상여를 맬 때에는 소란을 피우면서 다투고 때리며 못하는 짓이 없으며, 또 도가(都家)라 하여 매우 비밀하게 맺어서 망명(亡命)한 자를 불러 모으는 곳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의 관리조직인 도가 내부에 존재하는 검계다. 도가란 어떤 조직이건 조직의 중추를 이루는 관리 센터를 말한다. 향도계의 도가는 망명하는 자, 곧 죄를 지어 법망을 피하려는 자들을 거두어 숨겨주는 곳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도가 내부의 비밀 조직이 바로 검계였다.
숙종은 한성부(漢城府)에서 향도(香徒)를 뽑아 군정(軍丁)에 채우고 조례를 세워 폐습(弊習)을 고쳐달라고 청하자 그대로 따른다(숙종실록 10년 3월 22일).
이상에서 소개한 것이 유명한 검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석종 교수에 의해 비상하게 주목받은 바 있다. 즉 민중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했던 것이다(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일조각).

① 갑자년에 왜(倭)의 국서가 온 뒤로 소란이 날로 심해져 동대문으로 나가는 피난민의 가마와 짐이 꼬리를 물었다. 무뢰배들이 모여들어 계를 만드니, 혹은 살략계(殺掠契)라 하고, 혹은 홍동계(?動契)라 하고, 혹은 검계(劍契)라 하였다. 어떤 때는 한밤중에 남산에 올라가 태평소(角)를 불어 마치 군사를 모으는 것같이 하고, 어떤 때는 중흥동(重興洞)에 모여 진법(陣法)을 익히는 것같이도 하였다. 간혹 피난하는 사람을 쫓아가 재물을 빼앗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 사람의 목숨을 해치기까지 하였다.
② 청파(靑坡) 근처에 또 살주계(殺主契)가 있었는데, 목내선의 종[奴] 또한 가입하였으므로 목내선이 즉시 잡아 죽였다. 좌우 포도청에서 7,8명을 잡아서 살주계의 책자를 얻었는데, 그 약조에 ‘양반 살육’ ‘부녀자 겁탈’ ‘재물 약탈’ 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 그 무리는 모두 창포검(菖蒲劍)을 차고 있었다. 우대장 신여철(申汝哲)은 관대하게 용서한 적이 많고, 좌대장 이인하(李仁夏)는 자못 엄하게 다스렸다. 적당들이 남대문 및 대간(大諫)의 집에 방을 걸었는데, “만약 우리가 모두 죽지 않는다면, 끝내 너희 배에다 칼을 꽂고 말리라”고 하였다.
③ 광주(廣州)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피난하다가 길에서 적한(賊漢) 일곱 명에게 잡혀 강간을 당했는데, 적당을 잡고 보니, 그중 하나가 과부의 서얼 사촌이었고 검계의 당원이었다.
④ 교하(交河)의 깊은 산골에 시골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한 사람이 “장차 난리가 일어나면 우리도 양반으로 마누라를 삼을 수 있다”고 하자, 숙수(熟手) 개천(開川)이란 자가 큰 소리로 “듣자니 양반의 음문은 아주 좋다는데 이제 얻을 수가 있구나” 하였다. 그 마을의 양반이 이 소리를 듣고, 50대의 볼기를 쳤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광주의 적한과 함께 목을 베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
⑤ 광주의 적당을 잡아 신문할 때 청탁의 편지가 분분히 날아들자, 과부가 날마다 관문(官門)에 와서 울부짖었다. 적한이 사형되자, 과부도 목을 매어 죽었다.
‘반양반’적인 조직들
먼저 갑자년(1684년 숙종10년) 왜의 국서라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해두자. 이 국서는 한 해 전인 1683년 12월 대마도주가 보낸 것인데, 그 내용인즉 명이 청에 망한 뒤 반청(反淸)운동의 잔존세력으로 대만을 근거로 삼고 있던 정금(鄭錦)이 조선을 침입한다는 것이었다. 이 근거없는 말에 조야(朝野)가 발칵 뒤집혔고, 이 난리판에 불만세력들이 준동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의 해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자료가 어느 한 조직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있는가.
①에는 살략계(殺掠契) 홍동계(?動契) 검계(劍契)란 세 가지 명칭이 나온다. 그리고
②에는 살주계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조야회통’은 적어도 둘 이상의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①의 살략계, 홍동계, 검계는 동일한 조직으로 보인다. 습진한다는 것이 숙종실록에도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주계는 살주란 말에서 보듯이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검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이 왜 같이 취급된 것인가. 이 조직들은 모두 양반 체제를 위협한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④의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백성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조야회통’의 필자는 반양반적 조직과 의식이면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로 보았던 것이다.
이런 조직은 원래 그 성격이 비밀스럽다. 역사적인 대사건이 아닌 한 기록에 소상히 남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렇다면 검계는 숙종 때의 소탕으로 소멸된 것인가. 뜻밖에도 검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야회통’의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홍명희의 ‘비밀계’(임형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 사계절)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원자료는 아니고, 이원순(李源順)이란 사람의 ‘화해휘편’이란 책을 전재한 것인데, 모두 ‘조야회통’과 같고, 다음과 같은 끝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검계는 영조 때에 이르러 다시 말썽을 피워 포도대장 장붕익(張鵬翼)이 그들을 다스렸다. 검계의 당은 모두 칼자국이 있는 것으로 자신들을 남과 구별했기에 몸에 칼자국이 있는 자를 모두 잡아 죽이자, 마침내 검계가 사라졌다(劍契至英祖朝猶作梗, 捕將張鵬翼治之, 其黨皆以劍痕爲別, 故凡身有劍痕者, 皆殺之, 遂息)”.
영조대에 와서 검계가 다시 소란을 떨었기 때문에 포도대장 장붕익이 일망타진했다는 것이다. 이 자료의 기록자는 숙종의 검계와 영조대의 검계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아쉬운 것이다. 좀더 면밀한 자료 검색이 이루어진다면 혹 모르겠으되, 현재로서는 가망이 없다(향도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붕익의 검계 소탕은 매우 잔혹하고 철저했던 것 같다. 장붕익의 일망타진으로 검계는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이런 비밀조직은 잘라도 없어지지 않는 법이다. 조폭이 어디 한번 소탕으로 사라지던가. 알 카포네의 죽음으로 마피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순조실록에 검계는 다시 한번 몸체를 슬쩍 드러내고 있다. 순조 3년(8월9일) 사간 이동식(李東埴)은 상소에서 검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검계도 과거 숙종 때의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검계는 영조 때 사라진 듯하다가 되살아났던 것이다.
순조 3년에 검계의 이름이 다시 나온 것은 도하(都下), 곧 서울의 ‘무뢰배’들이 떼를 지어 승지 최중규(崔重圭)의 집에 돌입(突入)하여 최중규의 아들과 연로한 부녀(婦女)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순조실록 3년 8월1일). 형조 판서 채홍리(蔡弘履)는 범죄자들을 무겁게 의율(擬律)했어야 하는데도 심상하게 의율하여 파직되었다. 이동식의 상소도 아예 채홍리를 간삭(刊削)하고, 그를 추천했던 이면긍(李勉兢)을 귀양 보낼 것을 청하려고 쓴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검계란 조직이 적어도 숙종 때(1684) 발생하여 순조 때(1803)까지 120년간이란 장구한 시일에 걸쳐 존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순조 때의 검계가 숙종 때 검계의 직접적인 후신인지, 다시 말해 조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모종의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알 수 있다.
이들의 소업은 ‘조야회통’과 ‘순조실록’에서 보듯, 약탈·강간·살인이다. 이들은 대개 폭력을 행동강령으로 삼는다.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칼을 차고 다니며, 칼로 자해를 한다는 것도 모두 폭력 숭상의 징표인 것이다. 이들은 순조 3년의 사건에서 보듯 양반 중심의 사회 자체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다. 극히 반사회적 반체제적 속성을 가진 조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폭력이 정석종 등이 말하는 바와 같이 뚜렷한 반봉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폭력성이 증식될 경우 결과적으로 봉건체제에 위협은 되겠지만, 뚜렷한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검계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해보자. 영조 때 포도대장으로 유명했던 장붕익의 전기 ‘장대장전(張大將傳)’에 검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맑은날엔 나막신, 궂은날엔 가죽신
“서울에는 오래 전부터 무뢰배들이 모인 것을 ‘검계’라 하였다. ‘계’란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모인 것을 이르는 말이다.
검계 사람은 옷을 벗어 몸에 칼을 찬 흔적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낮에는 낮잠을 자고 밤에는 나돌아다니는데, 안에는 비단옷을 받쳐 입고 겉에는 낡은 옷을 입는다. 맑은 날에는 나막신을 신고 궂은 날에는 가죽신을 신는다. 삿갓 위에는 구멍을 뚫고 삿갓을 내려 쓴 뒤, 그 구멍으로 사람을 내다본다. 혹은 스스로 칭하기를 ‘왈자’라고 하며,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 쓰는 재물은 전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다. 양가 부녀자들이 겁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개가 호가(豪家)의 자식들이어서 오랫동안 제압할 수가 없었다. 장대장이 포도대장으로 있으면서 검계 사람을 완전히 잡아 없애고 발뒤꿈치를 뽑아 조리를 돌렸다.”(이규상, 張大將傳 중 ‘一夢集’)
유난스럽지 않은가.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 안에는 비단옷을 입고 겉에는 낡은 옷을 입으며, 맑은 날에는 나막신을, 궂은 날에는 가죽신을 신는다니, 일상적 행위를 철저히 뒤집는 것이다. 일견 저항의식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희한한 존재인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18세기의 문인인 이규상이 쓴 ‘장대장전’의 일부다. 장붕익은 앞서 ‘화해휘편’의 영조 때 포도대장으로 검계를 소탕했다는 바로 그 인물이다. 장붕익은 1725~35년 사이에 포도대장을 지냈다. 포도청에 관한 자료로는 ‘포도청등록’이 있지만, 남아 있는 문헌들은 대개 19세기 것이고, 18세기 초반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자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조대의 유일한 검계 자료일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검계는 약 50년 뒤까지 그대로 존속했다. 이것은 아마도 검계 자체가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계는 매우 비밀스런 조직인데, ‘장대장전’의 작자 이규상은 검계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이규상은 물론 양반이며, 그것도 명문 중의 명문인 한산 이씨다.
이규상은 이 이야기의 소스를 밝히고 있다. 즉 검계의 구성원이었던 표철주(表鐵柱)가 그 정보원이다. 이규상이 만난 표철주는 ‘집주름’이었다. 집주름이란 요즘의 부동산중개업자다. 이규상이 표철주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 70여 세였으며, 귀가 먹고 이도 빠지고 등이 굽은 늙은이로 쇠로 만든 삽을 지팡이 삼아 짚고 다니는 초라한 몰골이었다. 철주란 이름 역시 쇠삽을 짚고 다녀서 붙은 것일 터다.
일흔이 넘은 표철주는 초라한 노인이지만, 소싯적에는 “용감하고 날래며 사람을 잘 쳤으며, 날마다 기생을 끼고 몇 말의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영조가 임금이 되기 전 동궁에 있을 때 호위하던 세자궁의 별감(別監)이었다. 늘 황금색 바지를 있었는데, 비가 와서 옷이 젖으면 새 바지로 갈아입을 정도로 깔끔하고 사치스런 사람이기도 하였다.
이규상이 표철주를 만났을 때 그의 미간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사납고 불평스런 기색이 있었다. 이규상이 표철주에게 물었다.
“너는 마치 미친 사람 같구나. 평생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표철주가 한참 귀기울이고 주름진 입술을 달달 떨더니 몸을 뒤집고 철삽을 세우며 말했다.
“장사또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또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은 장사또를 지하에서 만나기 싫어서지.”
또 검계 사람들의 일을 상세히 전해주며
“적잖은 호한들을 장사또가 죄다 죽여버렸지.”
표철주가 공포에 떠는 장사또는 다름아닌 장붕익이다. 이야기로 보아 표철주는 한참 외지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어쨌거나 장붕익이 포도대장으로 있을 때 검계의 인물을 잡아 죽인 일이 검계 구성원에게는 일대 공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편하게 말해 장붕익은 조폭을 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소탕해버렸던 것이다.
머리를 기른 중
검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기서 끝난다. 그럼 이야기는 끝인가. 이규상은 검계에 대해 더 언급할 수 있는 중요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 위의 인용문에 검계 구성원이 자신들을 ‘왈자(曰字)’라고 칭했다는 부분에 주목하자.
별 소용은 없겠지만, 왈자를 사전에서 찾아보자. 한글학회에서 펴낸 ‘우리말 큰사전’은 왈자를 ‘왈짜’라 쓰고,
“①왈패 ②미끈하게 잘 생기고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왈패” 항에서는 “말이나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고 수선스러운 사람. 흔히 여자에게 대하여 쓴다”라 정의하고 있다. ①의 정의는 주로 여자에게 한정되는 것이니,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②는 확실한가? 이건 오입쟁이에 한정된 것이다. 별 도움이 안되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왈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연암 박지원은 ‘발승암기(髮僧菴記)’라는 글에서 ‘왈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발승암’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호다. 김홍연(金弘淵)이란 사람의 호가 발승암이고, 여기에 대해 그가 기(記)를 지어준 것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머리를 기른 중’이라니.
김홍연은 기사(騎射)에 능해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힘은 능히 손으로 범을 잡고 기생 둘을 끼고 몇 장의 담을 넘으며, 녹록하게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고 고금의 법서(法書)와 명화, 금검(琴劍) 이기(彛器) 기화이훼(奇花異卉)를 모으되, 천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준마와 명응(名鷹)을 좌우에 두었다.
어떤가. 재물을 분토처럼 쓰며 기방에 드나들고, 힘이 장사인 인간이다. 거기다 예술취향까지 있다. 김홍연은 개성 사람이다. 한말의 문장가 창강 김택영도 개성 사람이다. 조선시대에 개성 사람은 망국의 유민이라 출세를 할 수 없었다. 김택영 역시 이런 연고로 문한(文翰)에 탁월한데도 출세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개성인으로서 자의식이 매우 강했기에 개성 사람 중에 이름을 전할 만한 인물들을 골라 ‘숭양기구전’이란 전기집을 엮었다. 여기에 김홍연이 나오는 것이다.
김홍연의 집안은 부자로 묘사돼 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서적과 고서화를 많이 사주며 유업(儒業)을 권했다. 아버지는 아마도 부유한 상인이었을 터이고, 그게 한이 되어 자식에게 과거 공부를 권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홍연은 학업을 팽개친다. 이유는 과거에 골몰한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과로 옮긴다. 무예가 탁월했음에도 무과를 포기한다. 말인즉 “시골구석에서 무과에 급제한들 대장군의 인끈을 찰 수 있으랴”라고 하였으니, 개성 출신이라는 것이 출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그는 천하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름을 남겨 놓는다. 조선의 차별적 체제가 낳은 불우한 인물인 것이다.
연암은 김홍연을 ‘활자(闊者)’라 부르고, 활자에 대해서 다시 “대개 시정간에 낭탕우활(浪蕩迂闊)한 자의 칭호로 이른바 협사 검객의 부류와 같은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낭탕우활하다는 말에는 방탕하고 어리석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생업을 돌보지 않고 낭비벽이 심한 성격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왈자와 검계의 관계를 한번 더 따져보자. 김홍연의 경우, 분명히 기존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검계의 구성원처럼 반사회적 인물로 볼 수는 없다. 뒤에 소상히 언급하겠지만, 왈자의 활동공간과 검계의 활동공간은 일치한다. 즉 이규상의 ‘장대장전’에서 검계가 자신들을 ‘왈자’라고 칭하며,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고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즉 검계나 왈자나 모두 도박장이나 기방, 술집 등 도시의 유흥공간을 주무대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김홍연의 경우 기생을 끼고 담장을 넘었다는 기록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왈자와 검계는 상호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가?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표철주를 불러오자. 표철주는 연암 박지원의 글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연암은 18세기 서울 시정의 거지 출신으로 상가에서 신용을 쌓아 신의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던 ‘광문(廣文)’ 이야기를 전으로 쓴다. ‘광문자전(廣文者傳)’이 그것이다.
표철주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광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문 이야기는 한시(漢詩)로, 전(傳)으로 변형되어 기록에 남아 있다. 이름을 ‘달문(達文)’이라고 쓴 곳도 있다. 거지였던 광문은 나이가 들자 약국 점원이 된다. 하루는 약국 주인이 자신의 돈궤를 바라보다 또 광문을 쏘아보다 하며 무슨 말을 할듯말듯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눈치를 준 것이 여러 날이었다. 광문은 영문을 몰라 묵묵히 앉아 있을 뿐 그만두겠노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인의 조카가 돈꾸러미를 가지고 찾아왔다.
“지난번에 돈을 꾸러 왔다가 안 계시기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져갔지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광문에게 사과를 했다.
“내가 소인일세,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자넬 볼 면목이 없네.”
주인은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친구와 거래하는 부자, 상인들에게 칭찬했다. 이로 인해 광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광문은 신용 있는 사람이라, 대금업자들도 광문이 보증을 서면 패물이나 가옥 따위의 저당물이 없어도 쾌히 돈을 빌려 주었다.
광문은 서울의 기생가에서도 이름난 사나이였다. 서울의 명기(名妓)로 제아무리 미색이라도 광문이 이름을 내주지 않으면 한푼의 값도 없었다. 밀양 출신 기생으로 검무를 잘 추었던 명기 운심(雲心)이도 내로라하는 오입쟁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광문의 장단에 춤을 추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광문이 어느 날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하옥된다. 물론 무고였기에 다시 풀려난다. 광문이 풀려난 다음 이야기 역시 연암의 붓끝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이 ‘광문자전’ 끝에 붙인 ‘서광문전후’이다. 여기에 표철주가 등장한다.
광문이 옥에서 놓여 나오자 노소 없이 구경을 나가 서울의 저자가 여러 날 텅 빌 지경이었다.
광문이 표철주를 보고 말했다.
“네가 사람 잘 때리던 표망동이 아니냐. 이제는 늙어서 별수 없구나.”
망동은 표철주의 별호였다. 이어서 근황을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했다. 광문이 묻는다.
“영성군과 풍원군은 무양하시냐?”
“이미 다 돌아가셨단다.”
“김군경이는 지금 무슨 구실을 다니느냐?”
“용호영의 장교로 다니지.”
“그 녀석 미남자였거든. 몸은 좀 뚱뚱했지만 기생을 끼고 담장을 뛰어넘고 돈쓰기를 똥과 흙처럼 했지. 이제 귀한 사람이 되어서 만나볼 수도 없겠구나.”
광문이 옥에서 나와 맨처음 이야기를 건넨 사람은 표망동이다. 이어 두 사람은 공히 아는 사람들 안부를 묻는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이임이 분명하다. 그것도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가 아니다. 둘은 한 그룹이 되어 어울린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성격은 사뭇 다르다. 광문의 행동에는 반사회적인 속성이 없지만, 표철주에게는 반사회적인 속성이 있다. 광문의 “네가 사람 잘 때리던 표망동이 아니냐”는 첫마디는 표철주의 성격을 ‘폭력성’으로 집약하고 있다. 폭력이 사태 해결 수단이라고 믿는 것은 깡패와 조폭의 고유 성격 아닌가. 즉 검계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것이다.
나는 검계와 왈자는 집합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검계는 왈자에 포함된 부분집합이다. 즉 검계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왈자가 되지만, 모든 왈자가 곧 검계는 아닌 것이다. 즉 김홍연과 같은 사람은 왈자지만, 검계는 아닌 것이다. 왈자와 검계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공유하지만, 그 폭력의 방향이 반사회적인 방향으로 향할 때, 즉 강간, 강도 등의 행위로 향할 때 검계가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조직화할 때만.
그렇다면 다시 궁금해진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왈자가 된단 말인가. ‘게우사’라 불리는 국문소설이 있다. 이것은 이름만 남아 있고 작품은 없어져버린 것으로 알려진 판소리 ‘왈자타령’이다. 여기에 왈자들이 기방에 모인 장면이 나온다.
청루(靑樓) 고당(高堂) 높은 집에 어식비식 올라가니,
① 좌반의 앉은 왈자 상좌의 당하(堂下) 천총(千摠) 내금위장(內禁衛將) 소년 출신 선전관(宣傳官) 비별랑(備別郞) 도총(都摠) 경력(經歷) 앉아 있고,
② 그 지차 바라보니, 각 영문(營門) 교련관(敎鍊官)의 세도(勢道)하는 중방(中房)이며, 각사 서리(書吏), 북경(北京) 역관(譯官), 좌우(左右) 포청(捕廳) 이행군관(移行軍官), 대전별감(大殿別監) 울긋불긋 당당홍의(堂堂紅衣) 색색이라.
③ 또 한편 바라보니 나장(羅將)이 정원사령(政院使令) 무예별감(武藝別監) 섞여 있고, 각전시정(各廛市井) 남촌한량(南村閑良)
④ 노래 명창 황사진이, 가사 명창 백운학이, 선소리 송흥록이 모흥갑이가 다 있구나(‘게우사’: ‘한국학보’65, 일지사, 1991년)
① ② ③ ④로 나눈 것은 이들의 신분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①은 무반으로서의 양반이다. 원래 양반이 기방에 드나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문반의 경우이고, 무반은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출입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양반 중에 왈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뭐라 해도 왈자의 중추 세력은 역시 ②와 ③이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기술직 중인이 있다. 북경에 드나드는 역관(譯官)인데, 이들은 의관(醫官)과 함께 중인의 대표적인 존재다. 역관 신분을 이용하여 북경에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많다. 둘째 각사 서리(書吏)가 있다. 곧 서울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경아전(京衙前)이다. 경아전은 중인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중간계급이다.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는 사람들
그 다음 ‘각 영문 교련관의 세도하는 중방’이란 대개 군대의 장교를 말한다. ‘포청 이행군관’은 포교(捕校)인 것같고, 나장(羅將)은 의금부 나장을, 정원 사령은 승정원 사령을 말한다. 나장과 사령은 원래 다른 관청에도 있고 또 천역(賤役)이지만, 의금부 나장과 승정원 사령은 사회적 위상이 경아전과 같다. 대전별감은 대전, 곧 임금 주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며, 무예별감은 임금의 호위무사다. 각전시정이란 서울 시전의 상인이다. 상인들 역시 서리와 같은 사회적 위상을 지닌다. 남촌한량이란 서울 남산 기슭에 주거하며 무과를 준비하는 자란 뜻이지만, 그것의 정확한 사회적 의미를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②와 ③에 등장하는 부류는 거개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닌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이다. 여기서 꼼꼼히 따질 수는 없지만, 대개 서로 통혼(通婚)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보면 될 것이다. 왈자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중간계층을 모태로 하여 나온 존재들로 보면 무방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양반도 일부 끼어들고, 중간계층 아래의 상민도 일부 끼어들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 왈자 패거리의 특징이다.
왈자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 ‘서광문전후’의 광문과 표철주의 이야기를 다시 보자.
광문이 다시 표철주에게 말하기를,
“너도 이제 늙었구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
“집이 가난해서 집주름이나 하고 지낸다네.”
“너도 이젠 살았구나. 어허! 옛날 집 살림이 여러 만금이었지. 당시 너를 황금투구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투구가 어디 갔느냐?”
“이제야 나는 세정(世情)을 알게 되었다.”
광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도 목수질을 배우면서 눈이 어두워졌구만.”
표철주는 이규상이 말했던 것처럼 집주름이다. 그러나 젊어서의 표철주는 살림이 ‘여러 만금’이었고, 별명이 ‘황금투구’였다. 표철주는 원래 갑부였던 것이다. 왈자를 언급하는 자료들은 왈자가 대체로 부유한 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광문이 표철주에게 안부를 물었던 용호영, 장교를 다니는 김군경 역시 ‘돈쓰기를 똥이나 흙처럼’ 하는 그런 인간이었다. 연암이 직접 왈자라고 불렀던 김홍연의 경우도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고, 골동과 서화를 수집했던 인물이었다.
‘무숙이타령’(‘게우사’ ‘왈자타령’)의 주인공 무숙이는 ‘대방왈자’다. 이 소설은 무숙이가 새로 서울에 진출한 평양기생 의양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무진장 써대며 갖은 사치와 유흥판을 벌이다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나 의양이의 지혜로 회개한다는 내용이다. 대방왈자 무숙의 출신 성분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중촌의 장안갑부’다. 중촌은 지금 관철동 일대로 주로 역관 의원 등 중인과 시전 상인 등 서민 부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어쨌거나 장안의 갑부 대방왈자 무숙은 유흥과 사치에 돈을 쏟아 붓는다. 그는 오로지 돈 쓰는 것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왈자에게는 돈이 풍부하여 무진장 써대는 그런 속성이 있다. 물론 그들이 써대는 돈이 모두 자신만의 재산은 아닐 것이다. ‘장대장전’의 “쓰는 재물은 모두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라는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써대는 돈은 어떤 경우 살인 강도 행각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돈을 쓴다는 것은 사실 돈을 쓸 곳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사치와 낭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상품 따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정인들의 사치와 낭비를 가능하게 했던 전제 조건이란 무엇인가. 앞서 ‘게우사’의 왈자들이 기방에 모인 것을 묘사한 대목을 인용했는데, 기방이 그 전제 조건의 하나다.
조선시대의 기생은 국가 소유다. 조전전기에는 오로지 양반만 그들의 예능과 성(性)을 소비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에 예속되어 있던 기녀는 전쟁 전의 제도가 붕괴하는 틈을 타서 시정으로 진출했다. 기녀들은 국가에 복역(服役)하면서 한편 시정에 기방을 열고 자신들의 예능과 성적 서비스를 팔았던 것이다.
이 기방을 장악한 것이 곧 왈자들이다. 이들은 기방의 운영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고객이기도 하였다. 다시 ‘서광문전후’의 광문과 표철주의 대화를 읽어보자. 앞서 김군경에 대한 언급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분단(紛丹)이는 어디 갔지.”
“이미 죽었다네.”
광문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전에 풍원군(豊原君)이 밤에 기린각(麒麟閣)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오직 분단이만 데리고 잔 일이 있었지. 새벽에 일어나서 풍원군이 입궐(入闕)하려고 서두는데 분단이가 촛불을 잡고 있다가 잘못해서 초피 모자를 태웠것다. 분단이가 황공해서 어찌할 줄 모르자 풍원군이 웃으며 ‘네가 부끄러운 모양이로구나’ 하고 즉시 압수전(壓羞錢) 오천 푼을 얹어 주더군. 내가 그때 수건을 동이고 난간 밑에 지키고 있었는데 시꺼먼 것이 우뚝 선 귀신처럼 보였겠지. 마침 풍원군이 지게문을 밀치고 침을 뱉다가 섬뜩 놀라 분단에게 몸을 기대면서 ‘저 시꺼먼 것이 웬 물건이냐’고 소곤거리더군. 분단이 ‘천하에 누가 광문을 모르오리까’라고 아뢰었지. 풍원군은 빙긋이 웃으며 ‘저 사람이 너의 후배(後陪)냐. 불러들여라’ 하고 내게 큰 술잔을 주셨지. 그리고 당신은 홍로주(紅露酒) 일곱 잔을 마시고서 초헌(?軒)을 타고 가시더군.
이게 모두 지나간 옛날 일이야.”
“서울의 기생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지.”
“소아(小阿)란다.”
“그 조방(助房)군은 누구냐?”
“최박만(崔撲滿)이지.”
기생이야기라니, 감방에서 이제 막 나온 인물이 나누는 이야기 치고는 좀 한심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바로 기방이었기 때문에 기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후배’ ‘조방군’이란 말이다. 이건 바로 기부(妓夫)를 말한다. 기부는 기생의 서방으로 대개 기녀의 매니저 노릇을 한다. 조선후기의 기생은 대개 지방에서 올라온다. 기생이 서울에 올라오면 당장 의식주 해결에 곤란을 겪게 되는 바, 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생을 장악해 기생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이 다 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전별감, 포도청 포교, 의금부 나장, 승정원 사령 등 몇몇 제한된 부류만 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기방의 고객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왈자들이 곧 기방의 운영자이고 또 고객이었던 것이다. 앞서 김홍연은 기생을 둘이나 끼고, 김군경이 뚱뚱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끼고 몇 장의 담을 뛰어넘었다고 한 것은 모두 이들과 기방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다.
왈자와 기생 간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 주는 증거가 ‘춘향전’의 이본(異本)인 ‘남원고사’다.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던 춘향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자 남원의 왈자들이 몰려들어 춘향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옥문 앞에서 왈자들이 소란을 떨자 옥사장이 나무란다.
옥사장(獄鎖匠) 하는 말이,
“여보시오. 이리 구시다가 사또 염문(廉問)에 들리면 우리 등이 다 죽겠소.”
한 왈자 내달으며 하는 말이,
“여보아라 사또 말고 오또가, 염문 말고 소곰문을 하면 누구를 날로 발기느냐? 기생이 수금(囚禁)하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지 네 걱정이 웬 일이니?”
남원의 왈자라고 했지만, 읽어보면 서울 왈자들이다. 그것은 “기생이 수금(囚禁)하면(옥에 갇히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기생과 왈자가 밀착된 관계가 아니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
기방은 생산 공간이 아니라, 유흥 공간이다. 놀고 마시는 곳이다. 왈자들의 소업은 오로지 ‘노는 것’일 뿐이다. 노는 것에서 도박을 빼놓을 수 없다. 이규상은 왈자에 대해 “도박장과 창가(娼家)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도박장이라 해서 라스베이가스의 도박장이나, 강원랜드, 혹은 합법화된 호텔의 카지노는 아닐 터이다. 중국만 해도 송나라 때 전문 도박장이 생기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공식적 도박장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정식 도박장의 존재 여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도박판이 벌어지면 어디나 도박장이 된다.
조선후기는 도박이 비상하게 발달한 시대였다. 투전, 골패, 쌍륙 등 온갖 종류의 도박이 성행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숙종 연간에 수입된 투전이 엄청난 기세로 유행하였다.
저 지체 높은 양반에서부터 하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투전 열풍에 휩싸였음은 여러 문헌이 증거하는 바이다.
아니 투전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갑오니 장땡이니 하는 것도 원래 투전의 족보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 실례를 한번 보자. 김양원(金亮元)이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조희룡(趙熙龍)과 절친한 사이였다.
조희룡이 누군가? 19세기의 빼어난 서화가이자, 비평가이자, 시인이었다.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제자이기도 하였다. 이런 사람의 친구이니, 뭐 좀 고아한 사람으로 알겠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조희룡은 ‘호산외기(壺山外記)’에서 ‘김양원전’을 지었는데, 그 첫머리가 이렇다.
김양원은 그 이름은 잊어버렸고, 자로 행세했다. 젊어서 유협 노릇을 했는데, 계집을 사서 목록에 앉혀 술장사를 했다. 허우대가 크고 외모가 험상궂어 기생집과 도박장을 떠돌아다녔지만, 기가 사나워 누구하나 그를 업신여기지 못했다.
행태를 보아하니, 김양원은 왈자다. 그는 뒷날 시인으로 자처하고 시에 골몰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기방과 술집, 도박판을 쫓아다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남원고사’에도 왈자들은 춘향을 찾아가기 전에 골패노름을 한참 벌인다.
도박장 따위를 전전하는 왈자의 생리가 짐작이 되시는지.
주먹을 휘두르고 기방과 술집, 도박판을 쫓아다니는 왈자에 대해 시시콜콜 늘어놓는 것은 근엄한 도덕주의자들의 눈에는 정말 쓸데없는 언어의 낭비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왈자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왈자는 조선후기 민간 예능의 주향유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원고사’를 보면 왈자들이 춘향이를 찾아가면서 여러 행각을 벌이는 썩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민간예능의 주 향유자
왈자들은 먼저 노래를 부르는데, 선소리와 ‘신선가(神仙歌)’ ‘춘면곡’ ‘처사가’ ‘어부가’ 등이 주 레퍼토리다. 선소리는 ‘서울 중심의 경기요와 서도 소리의 속된 노래의 일종’이며, ‘신선가’는 경기잡가이고, ‘춘면곡’ ‘처사가’ ‘어부사’는 십이가사의 레퍼토리다. 이 노래들은 서울의 기방에서 오입쟁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것들이었다. 왈자들은 이런 민간 가요의 주 향유자였던 것이다. 나는 조선후기의 음악을 비롯한 예능이 이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실제 왈자들은 연예인을 지배하고 있었다. 앞서 인용했던 ‘게우사’에서 기방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노래 명창 ‘황사진’ 가사 명창 ‘백운학’ 선소리의 ‘송흥록’ ‘모흥갑’이었다. 황사진과 백운학은 알 길이 없지만, 송흥록과 모흥갑은 국문학사를 장식하는 판소리 광대들이다. 이들 역시 왈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 증거로 ‘게우사’의 주인공 무숙이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창한 유흥판을 벌이면서 삼남의 제일가는 광대, 산대놀음을 하는 산대도감의 포수와 총융청 공인, 각 지방의 거사 명창 사당패를 모으고, 우춘대·하은담·김성옥·고수관·권삼득·모흥갑·송흥록 등 22명의 명창 광대를 불러들인다.
물론 과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그 증거로 가사 ‘한양가’의 ‘승전(承傳)놀음’을 들 수 있다. 승전놀음은 왈자의 한 부류인 대전별감이 서울의 기생을 총동원하여 거창하게 벌이는 놀이판인데, 별감은 금객, 가객 등을 불러 모으고 있다. 왈자들은 연예인의 예능을 소비하는 주체였으며, 돈 이외에도 그들을 불러올릴 권력이 있었던 것이다.
왈자는 책 읽고 공부하는 그런 세계와는 팔만구천리나 떨어진 존재다. 왈자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력 폭력이다. 말이 아니라 주먹이 통하는 세계에 살던 인간인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왈자와 검계는 집합의 관계다. 왈자가 전체집합이라면, 검계는 그 속에 포함된 부분집합이다. 그들의 폭력이 반사회성을 띠면 검계가 되었던 것이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이들은 주로 먹고 마시고 노는 데 골몰하던 부류다. 조선후기 시정 공간을 북적대게 만든 흥미로운 존재인 것이다. 왜 이런 부류가 나타나게 되었던가. 조선사회는 상업과 농업 분야의 발달로 약간의 경제적 잉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경제적 잉여를 바탕으로 사치와 유흥이 발달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살폈듯 왈자란 대개 중간계층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이 부를 축적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당시의 사회 체제로 보아, 과거를 통해 고급관료가 되거나 학문을 하여 명예를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들이 유흥으로 빠진 것은 거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어쨌거나 조선은 조용한 아침이란 이미지와는 결코 맞지 않는 나라였다. 검계가 살인과 강간과 강도를 저지르고, 왈자가 술집과 기방과 도박판에서 왁자하게 야단법석을 떠는 곳이었다. 조용하긴 뭐가 조용하단 말인가.
조선사회에도 도박은 있었다. 도박이 횡행할 때 미래는 암담했고 백성들은 고달팠다.‘쪼기’ ‘도리짓고땡’이 그 모습을 드러낸 조선시대 도박의 세계로 떠나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로마 병사들은 주사위를 굴려 예수의 옷을 나눠가지자고 내기를 했다. 경주 안압지에서는 내기용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은 부처와 저포(樗蒲·쌍륙雙六)로 내기를 하여 미인을 얻었다. 도박의 종류는 무수하고 다양하다. 화투·포커·마작·슬롯머신·바카라·룰렛 등 우리는 아마도 그 명칭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도박은 불법이 아니다. 라스베이거스, 모나코의 도박장, 경마·복권 등 제도화된 도박을 상상해 보라. 이처럼 도박은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 인류의 공통적 경험이며, 골몰과 찬미의 대상이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박에 골몰하게 하는가? 도박은 인간의 본성에 관계된 것인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도박에 탐닉하는 프로그램이 장치되어 있는가?
도박은 게임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것(대부분 화폐로 환원된다)이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가 결합했을 때만 도박이 된다. 아무것도 걸지 않은 고스톱은 도박이 아니다. 게임 없이 재물을 주고받는 것은 자선사업일 뿐이다. 게임의 종류는 한정이 없다. 위에 든 것 외에 동전의 홀수·짝수 맞히기도, 가위바위보도 도박이 된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 올리기
내 생각에 도박은 두 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최적의 먹이획득이론. 생명체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먹이를 획득하려 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이 원리의 제도화다.
도박과 자본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는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필수적인 매개물로 표방하지만(표방만 한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도박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생략한다. 즉 도박은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생략한 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획득하려 한다. 도박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불확실성. 도박은 불확실한 미래에 운명을 맡긴다. 도박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필연과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과 불확실성일 뿐이다. 이것이 도박의 세계관이다.
도박의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도박의 유행 정도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손에서 바로 입으로 가져가는, 낮은 생산력의 사회에서 도박이 성행할 확률은 높지 않다. 높은 생산력은 도박을 성행케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후진사회에서도 도박은 성행할 수 있다. 이래서 둘째 조건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도박이 성행할 수 없다. 도박은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성행한다.
이 글에서 나는 조선후기 사회와 도박의 관계를 검토한다. 경제적 변화가 역사학의 관심사라면, 그것이 인간의 구체적 일상적 삶과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내 관심사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들이 도박에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것은 ①바둑 ②장기 ③쌍륙 ④투패(鬪牌 즉 마조馬弔인데, 보통 말로 투전鬪?이라 한다·원주) ⑤강패(江牌 즉 골패骨牌 원주) ⑥척사(擲柶 우리나라 풍속의 윷놀이·원주)이다. ‘대명률’에 ‘모두 장(杖) 80에 처한다’고 한 것은 어떤 놀이를 막론하고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는 것이다. 무릇 놀이로써 재물을 취하는 자는 그 형률이 모두 같은데 오직 바둑은 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니 구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산은 여섯 가지 도박을 들고 있는데, 여섯 가지 모두가 균등하게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미리 말하자면 다산이 같은 글에서 지적했듯,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투전·골패·쌍륙이었고, 그 중에서 투전이 조선후기 도박계 제왕의 지위를 점하였다. 바둑·장기·윷놀이는 조선후기에 생겨난 종목이 아니라, 고래로 있었던 것이고 도박으로 특별히 유행한 것도 아니니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투전은 뒤에 본격적으로 살필 것이므로 우선 쌍륙과 골패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쌍륙은 체스판과 같은 장기판에 쌍방 16개의 말을 일렬로 배열하고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 그 숫자에 따라 말을 전진시켜, 원래 자기 말이 있던 라인에서 모든 말이 먼저 다 벗어나는 쪽이 이긴다. 쌍륙은 이규보(李奎報)의 시에 보이니 고려 때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쌍륙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사이에 성행하였다. 지금도 안동지방 고가(古家)의 여인들 사이에 간간이 행해진다.
골패는 가로 1.2㎝∼1.5㎝, 세로 1.8㎝∼2.1㎝의 납작하고 네모진 검은 나무 바탕에 상아나 짐승뼈를 붙이고 여러 가지 수를 나타내는 크고 작은 구멍을 새긴 것으로 모두 32쪽이다(요즘의 마작과 비슷하다). 노는 방법에는 꼬리붙이기·포(飽)·여시·골여시·쩍쩍이 등이 있다.
노는 방법은 매우 복잡해 여기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 ‘꼬리붙이기’를 예로 들면, 12짝을 갈라 한 사람이 패를 내면 상대방이 낮은 패를 계속 내 더 이상 낮은 숫자를 낼 수 없으면 진다(여기에도 더 복잡한 룰이 있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생략한다). 골패는 쌍륙보다 더 유행한 종목이었다. 민요까지 나왔을 정도다.
“얼싸 오날 하 심심하니/훗패 작패 하여 보자/쌍준륙에 삼륙을 지르고/쌍준오에 삼오를 지르니/삼십삼천이십팔수/북두칠성이 앵돌아졌구나”(경상도 민요 ‘골패타령’)
조선후기 도박계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투전(鬪? 또는 投?이라고도 쓴다). 조선후기는 물론 19세기 말 화투가 수입되기 전까지 도박계를 완전히 석권했고, 화투가 수입되자 그 놀음 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 40대 이상이면 아마도 화투 2장을 쥐고 하는 이른바 ‘쪼기’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쪼기는 고스톱이 화투판을 석권하기 전 오랫동안 유행하던 종목이다. 쪼기의 ‘땡’과 ‘족보’, 그리고 ‘짓고땡’ 종목은 모두 투전에서 유래한 것이다(유구히 이어진 민족의 전통! 거룩하다). 이국(異國)에서 수입해온 ‘화투’에 민족적인 정조를 불어넣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한 투전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조(正祖)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의하면, 숭정(崇禎·1628∼44) 말년에 역관(譯官) 장현(張炫)이 북경에서 구입해 온 것이라고 하였다.
투전이 중국에 기원을 둔 것이란 말인데, 도대체 중국의 어떤 도박을 수입했던가? 투전은 원래 중국의 마조(馬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 19세기 인물인 조재삼(趙在三)의 ‘송남잡지(松南雜誌)’에 의하면, 마조는 원대에 시작됐으며 중국 고금의 인물을 품제(등급을 매김)한 120장으로 된 놀음이라고 한다(마조에 대해서는 이상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룰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120장짜리 마조를 간략화한 것이 투전이다.
투전은 80장(혹 60장짜리도 있다)의 종이 쪽지로 구성되는데, 그 폭은 손가락 굵기만 하고, 길이는 15㎝정도이다. 한 면에 사람·물고기·새·꿩·노루·별·토끼·말 등의 그림이나 글을 흘려 적어 끗수를 표시한다. 같은 글자(그림)가 10씩 모여 80장을 이루는데, 이것을 팔목(八目)이라 한다. 각각의 명칭도 달라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인장(人將)을 황(皇), 어장(魚將)을 용(龍), 조장(鳥將)을 봉(鳳), 치장(雉將)을 응(鷹), 성장(星將)을 극(極), 마장(馬將)을 승(乘), 장장(獐將)을 호(虎), 토장(兎將)을 취(鷲)라 한다고 하였으며, 사람·물고기·새·꿩은 노(老)로 사용되고, 별·말·노루·토끼는 소(少)로 사용된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 투전목에는 손을 타도 훼손되지 않게 기름을 먹였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투전방식을 알아보자. 돌려대기(이것은 아마도 ‘짓고땡이 투전’과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가장 널리 놀던 것으로, 40장의 투전목을 쓴다(60장을 쓰기도 한다). 선수가 판꾼 다섯 사람에게 한 장씩 떼어 모두 5장씩 나누어주면 판꾼들은 각기 3장을 모아서 10, 20, 30을 만들어 짓고 나서, 나머지 2장의 숫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만약 3장을 모아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하며, 2장의 숫자가 같으면 ‘땅’(혹은 땡)이라 하는데, 이 중에서 ‘장땅’이 가장 높으며, 9땅, 8땅의 순서로 낮아진다. ‘땅’이 아닌 경우에는 2장을 합한 것의 한자리 수가 9가 되면 갑오라 하여 가장 높고 9, 8, 7, …의 차례로 내려간다. 그리고 갑오가 되는 수 가운데 1과 8은 ‘알팔’, 2와 7은 ‘비칠’이라 하고, 5가 되는 수 중에서 1과 4는 ‘비사’라고 부른다. 2장을 더한 수가 10처럼 한자리수의 끝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무대’라고 하여 가장 낮은 끗수로 친다.
잠시 투전판에서 유행되던 족보의 이칭에 대해 간략히 감상하자. ‘삼팔돛대가보’는 3과 8과 8이 합하여서 가보가 될 때, ‘섰다 벗었다 안경가보’는 1과 8이 합하여서 가보가 될 때, ‘일장통곡하는구나’는 1과 10이 합한 가장 끝수가 낮을 경우, ‘기운센놈’은 10과 4가 합한 끗수일 때에 하는 말인데 흔히 ‘장사’라고도 한다. 재미있지 아니한가?
이 외에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동당치기’ ‘가보치기’ 등이 있는데, 동당치기는 투전 40장을 여섯 장씩 나눠가지고 같은 자를 두 장 혹은 석 장씩 맞추는 노름이다. 가보치기(갑잡골, 갑자꼬리, 가보잡기)는 40장씩 가지고 두 장씩 혹은 석 장씩 뽑아서 아홉끗을 짓는 노름이다.
이제 도박판의 현장을 볼 차례다. 정조 때 비정통적 산문체(散文體)를 구사하고 이단적 사상(천주교)에 물들었다 하여(사실은 아님), 죽임을 당했던 문인 강이천(姜彛天·표암 강세황의 손자)은 18세기 후반기 서울의 풍속을 상세히 묘사한 106수의 한시 ‘한경사(漢京詞)’를 남겼는데, 여기에 도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길게 자른 종이에 날아갈 듯 꽃모양 그려 / 둘러친 장막 속에 밤도 낮도 모를레라.
판맛을 거듭 보자 어느새 고수 되어 / 한마디 말도 없이 천금을 던지누나.
紙板長裁花樣? , 深圍屛幕沒朝昏.
賭來多局成高手, 擲盡千金無一言.
네 사람 마주앉아 도박판을 열고서 /
골패 여덟 짝 나누어 쥐었네 /
그중 한놈 좌중 향해 제 끗발 자랑하며 /
1전으로 10전을 한꺼번에 따오네.
四人相對戱場開, 牙骨分持共八枚.
獨向坐中誇牌格, 一錢賭取十錢來.
‘하우스’ 개설자는 엄히 처벌해야
앞의 작품은 투전판이고 뒤의 작품은 골패하는 장면이다. 좀더 클로즈업해 보자.
⑴ 천하 잡것 무숙이 아무런 줄 모르고서 이새 돈을 좀 아니쓰니 그날부텀 또 놀아나는데, 신명을 부쩍 내어 골패 놀음을 시작한다. 잡기 일수 오입장이 사오 인을 청좌하여 밤노름을 부쳐 놓고 좌우 쌍촉 돋우어 켜고 중두내기 판을 차려 순끗주기 시작한다. 홰홰 둘러 패를 친즉 무숙이는 관을 잡고 고나치는 제 사면을 둘러보니 삼칠이는 쌍기 잡고 좌우편 대사와 사십 이상 혹겨하니 다만 행전 무숙이라. 사오차 대격 치르니 남은 돈이 얼마러냐, 톡톡 털어보니 두 돈 오 푼 남았구나.
⑵ 한편이서는 네 대갈수야 오구일성(五九一星)이로고다. 어렵다. 조장(鳥將)원 맞추기 반(半)씩 하자. 석류 먹든 씨나 그만 있소. 척척 쳐서 섞어 쥐어라. 셕조(夕鳥)는 하공정(下空庭)이로고나. 바닥 둘째 잎을 내소. 어데 갈까? 이 애 하자던 반이나 하자.
또 한편에서는 삼십삼쳔(三十三天) 바로 쳤다. 민둥이를 들이소. 당당홍의(堂堂紅衣) 증초립에 건양재(建陽峴)를 넘는구나. 벌거하다, 이사칠(二四七) 들이소.
⑴은 판소리 열두마당 중 하나인 ‘게우사’의 일부인데, 골패하는 장면이고, ⑵는 ‘춘향전’의 이본인 ‘남원고사(南原古事)’의 일부로 투전하는 장면이다. 보다시피 알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나는 이 부분에 각주를 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어쨌건 도박하는 장면을 한번 본 것으로 만족하자.
도박의 성행과 함께 도박장에는 오늘날 우리가 전문도박꾼 내기 도박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행태가 벌어졌다. 도박에 미치면, 밤이고 낮이고 ‘본성을 잃어버리고 넋이 나간(失性喪魄)’ 채로 봉두난발에다 눈이 시뻘게져서 귀신 꼴이 되는 것(윤기·尹햍, ‘無名子集’,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7)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였다. 도박장을 개설해 돈을 뜯고 사는 인간도 물론 있었다.
“집에 투전(投?)꾼을 모으고 돈을 대주며 이자를 거두거나 또는 ‘방값(房價)’ ‘기름값(油價)’ ‘밥값(飮食價)’ 등의 명목을 두어 생리(生理)로 삼는 자가 있으니, 이는 곧 뚜쟁이와 같은 부류라 내가 입에 올리기도 싫다”(윤기의 無名子集 중).
도박장을 개설하고 고리로 이자를 놓거나 자릿세를 뜯는 자들까지 나왔던 것이다. 다산이 “도박장을 설치하고 노름판을 주관한 자는 형률에는 비록 죄가 같을지라도 이는 원흉이니 그 벌이 마땅히 배가 무거워야 한다”며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 발언으로도 전문적 도박장의 성황을 알 만하다.
김구 탈옥공작 벌인 투전꾼
사기도박도 있었다. 19세기 말의 자료지만,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사기도박의 방식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일본인 밀정을 죽이고 투옥된 자신을 빼내기 위해 자기 가산을 쏟아부었던 김주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인물이 사기도박꾼이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주경은 원래 강화의 아전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도박에 몰두했다. 부모가 그를 징계하려고 곳간에 가두자 투전 한 목을 가지고 들어가 연구(?)에 골몰하여 묘법을 터득해 나왔다. 그 뒤 서울로 올라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투전을 몇 만 목 만들어서 강화로 돌아왔다. 친구들을 통해 투전을 판 뒤 투전판마다 뛰어들어 수십만 냥의 거금을 땄다. 이 돈으로 관청 하속배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김구의 탈옥공작까지 벌였던 것이다.
자, 전문적인 도박판과 사기도박까지 출현했다면, 도박의 열기와 성황을 짐작할 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도박의 성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제부터 도박을 유행시킨 주체와 도박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던 상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 세 자료를 보자.
(1) 혹은 스스로 왈자(曰字)라 일컬으며, 도박장[博場]과 가방[娼肆]에 종적이 두루 미친다. 쓰는 재물은 죄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다(이규상, ‘張大將傳’ ‘韓山世稿’).
(2) 김양원(金亮元)은 …젊어서 유협(遊俠)이었는데, 계집을 사서 술청에 앉히고 술장수를 하였다. 몸이 살지고 생김이 사나와 기생방과 도박장[賭博]을 돌아다녔지만, 기가 사나와 남들이 업신여기지 못했다(조희룡, ‘金亮元傳’ ‘壺産外記’).
(3) 우리나라는 자고로 협객이 없었다. 왕왕 협객이라 일컫는 사람은 모두 기방에서 떼지어 놀며 칼로 맹세를 하는 옛날의 청릉계(靑陵契·미상)와 같은 부류였다. 혹은 가산을 돌아보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마조(馬弔·투전)를 일삼는 자들이었다(이옥, ‘張福善傳’: 李家源 編, ‘李朝漢文小說選’).
위의 자료에서 박장(博場)이란 도박장이고, 또 이것은 주로 기방이나 술집에 개설되었던 것이다(복잡한 설명은 생략). 김홍도의 아들 김양기가 그린 투전 장면을 보자(그림 1).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벌인 투전판이다. 몇 사람은 한창 판을 벌이고, 한 사람은 이불에 기대어 노동(?)에 지친 심신을 가다듬고 있으며, 기생은 술상을 나르고 있다. 이것은 기방에서 벌어진 투전판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전문적 도박과 매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장면, 곧 도박장과 기방의 결합을 초시대적인 현상으로 범연하게 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치노예로서 기생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로서 기방의 존재는 조선전기까지 소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방이 도시민의 유흥공간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조선후기에 와서인 것으로 추정된다(양반은 기방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왜 중간계급이 유흥계와 도박판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인가? 앞서 투전을 수입했던 인물 장현(張炫)을 예로 들어보자. 장현은 인동장씨(仁同張氏)인데, 인동장씨는 역관가문으로 유명한 집안이다. 장현 역시 역관으로서 대단한 치부를 했던 사람이다(또 장희빈의 당숙인 관계로 한때 상당한 권세를 누렸다).
중인 장현이 투전을 퍼뜨렸다는 사실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인들은 조선시대 최고의 사회적 가치인 고급관료로 진출하는 길이 봉쇄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중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양반을 제외한 사회구성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중인들의 경우 양반에 필적하는, 때로는 양반을 능가하는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갈등의 강도가 훨씬 강렬했던 것이다. 이들의 경제적(그리고 지적 문화적) 에너지는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하고, 다분히 소비적인 데로 흐르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학·예술과 같은 생산적 방면으로 전이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도박처럼 낭비적인 데로 쏠리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을 19세기의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른바 중인의 자제들은 독서를 전폐하고 방탕만을 일삼아 투전을 문장으로 알고 주색(酒色)을 승사(勝事)로 삼아 사람 모양을 갖춘 자가 거의 없다”(‘象院科榜’수록 中人通淸運動 資料, ‘韓國學報’45).
중인에 의해 수입되고 중간계급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투전이 시정공간의 오락에 머물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전의 가공할 위력은 수입된 지 100년이 채 못되어 양반층까지 전면적으로 오염시키기 시작했다.
박지원(朴趾源)의 경우를 들어보자. ‘열하일기’에 연암(燕巖)이 밤에 역관(譯官)·비장배(裨將輩)와 투전판을 벌여 돈을 따고 득의연하는 장면이 있다. 양반 명문가의 자손인 연암(반남박씨는 삼한갑족三韓甲族에 든다)이 투전이라니?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한 것인가?
양반사회에서 투전의 유행은 놀라울 정도였다. 다산은 앞서 인용했던 ‘목민심서’에서 “재상·명사들과 승지 및 옥당 관원들도 이것으로 소일하니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소나 돼지 치는 자들의 놀이가 조정에까지 밀려 올라왔으니 역시 한심한 일이다”고 한탄한 바 있다.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참고용으로 들어 보자. 재상이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정승급 최고위 관료를 지칭한다.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나, 홍문관(弘文館·玉堂) 관원 등은 조선시대 관직체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관직으로 치는 청직 중의 청직이다.
이들이 도박에 골몰했다는 것은, 양반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기대, 즉 양반을 유가(儒家)의 이데올로기에 의식화된, 그리고 금욕적 자기절제가 생활화된 인간이라는 생각에 반한다. 따라서 다산의 말은 사소한 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다산 특유의 버릇 때문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전해지는 여러 자료들은 다산의 말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증언한다. 앞서 인용했던 윤기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해 보자.
“세속의 이른바 투전(投?)이란 것은 으뜸가는 패가망신(敗家亡身)의 물건이다. 그 해(害)는 주색(酒色)보다 심하므로 내가 이미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위로는 부귀한 집안에서부터 아래로는 여대하천(輿?下賤)에 이르기까지 탐혹(貪惑)하지 않음이 없고 또 묘당(廟堂)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경악(經幄·경연 經筵)에 출입하는 자들도 모두 풍속을 이루어 심지어 투전을 하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할 정도이니, 심하도다! 속습(俗習)의 쉽게 물들고 이해하기 어려움이여, 그 폐단은 반드시 도적이 되고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
묘당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와 경악에 출입하는 자는 다산이 말한바 재상·명사와 승지·옥당관이다. 이 자료에서 보듯 양반사회의 최상층부까지 투전에 전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볼 필요가 있겠다. 원인손의 경우다. 원인손의 아버지는 원경하(元景霞·1698~1761)로 병조판서·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더욱이 원경하는 효종의 딸인 경숙옹주(敬淑瓮主)의 손자다. 원경하의 아들 원인손(1721~1774) 역시 이조판서·우의정에까지 올라 양반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극한에 이르렀으니 원경하 가문은 명문 중의 명문이라 하겠다. 투전의 고수를 ‘타자(打子)’라고 하는데, 바로 이 원인손이란 인물이 18세기 투전계 최고의 타자였다.
원인손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전설에 의하면 그는 투전목 80장을 한번 보면 섞어 뒤집어 놓아도 이면의 그림을 다 알아맞혔다고 한다.
아버지 원경하가 투전을 못하도록 후당에 가두자 원인손은 투전꾼을 불러모아 병풍으로 사면을 가리고 촛불을 켜서 투전에 골몰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투전패를 모두 읽어내는 그 탁월한 기량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던 원경하가 “이것은 하늘이 낸 재주이며, 귀신의 지혜다.(此乃天生也, 神智也)”라고 탄식하고 다시는 금하지 않았다고 한다.(李遇駿, ‘夢遊野談’ 寶庫社)
투전의 유행은 양반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과거준비와 학문에 열중해야 할 양반가의 자제들이 투전에 골몰한다는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었다. 18세기 산문작가이자 관료였던 유한준(兪漢雋·유길준의 5대조)은 자신의 친구(실명은 미상)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잡기”
“잡기(雜技)의 경우 주색(酒色)에 비해 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에 없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주색입니다. 천하에 끝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있어 온갖 해를 만들어 내며, 없어도 하나 손해될 것이 없는 것은 잡기입니다.…그러므로 이것을 하는 자는 모두 여항(閭巷) 시정(市井)의 악소년(惡少年)으로서 난잡하고 부랑한 무뢰배(蕪賴輩)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무리를 불러 모으고 한데 어울려 도박판을 벌이다가 먼데 귀양을 가기도 하여…크게는 집안을 망치고 작게는 자신을 망칩니다.
비록 그 일은 다르지만 끝내는 주색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가짐을 단속하는 선비들이 미워하여 피하는 바이며, 스스로를 수양하는 사람들이 피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족하(足下)는 깨닫지 못하고 용감하게 하여 거두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면서 돌아올 줄 모르니, 이런 까닭으로 친구로 사귀는 자들이 모두 글을 하지도 않고 무예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닌 천지간에 이른바 어리석고 도깨비 같은 무리들이며, 함께 어울리는 자들도 모두 이상하고 잡되며 어리석고 패역(悖逆)한 부류들입니다”(유한준, 與或人書, ‘自著集’).
편지의 수신자는 물론 양반이며, 그것도 지체 상당한 양반으로 짐작된다. 양반사회 내에서 도박의 유행은 실로 양반가의 자제를 시정잡배와 다름없이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투전은 양반사회 내에 깊숙이 침투해 하나의 생활이 되었다. 18세기의 풍속지인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는 양반가에서 투전이 성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자리에 둘러앉아 투전 쪽을 어지럽게 던지노니 /
어(魚)·조(鳥)·장(?)·성(星)이 노(老)·소(少)로 나뉘었다. /
자제(子弟)들 삼동(三冬)이면 무엇을 읽는가 /
세시(歲時)면 팔대가(八大家)를 숙제로 권하네.
紙牌圍席擲紛分, 魚鳥?星老少分.
子弟三冬何所讀, 歲時勤課八大家.
(지패紙牌를 八大家라 한다-원주).
팔대가(八大家)란 명나라 모곤(茅坤)이 엮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을 말하는 것으로, 17세기 이후 산문학습의 주 텍스트였다. 투전을 ‘팔대가’라 한 것은 투전목이 80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투치는 것을 ‘진도 나간다’고 하거나, 고상하게 ‘동양화 감상’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선사회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투전은 이제 거대한 사회문제, 곧 병리적 현상으로 부각되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투전은 “마음을 망가뜨리고 재산을 탕진하여 부모와 종족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었으며, “아전이 포흠(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소비하는 것)을 지고 군교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의 빌미가 되었다.
지방관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동헌에 앉아 저리(邸吏)나 책객(冊客)들과 투전·골패에 골몰했다고 한다. “종손(이란) 핑계(로) 위답(을) 팔아 투전질을 생애로”(가사 ‘愚夫歌’) 삼는 자가 속출했다. 윤기는 앞서 인용했던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개 공채(公債)·사채(私債)를 혹 갚지 못하는 자는 욕설과 독촉을 함께 받아 옥에 갇히고 곤장을 맞는 지경에 이르러도 오히려 견디어 나갈 수가 있지만, 투전빚은 갚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혹 갚지 못하는 경우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을 속여 빚을 내야 한다. 그래도 또 부족하면 집안사람을 속이고 집안의 물건을 훔쳐 내며, 그래도 또 부족하면 남의 집을 터는 짓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반드시 도적이 되고 마는 까닭인 것이다.”
투전빚은 얼마나 잔혹했던 것일까? 투전빚은 잊혀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야차처럼 끝까지 사람을 따라다니며 개인과 가문을 결딴내었다. 도박의 유행에 대해서 금령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삼법부(三法司 형조·한성부·사헌부)에서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자는 중벌에 처하게 되어 있었으나(그림2), 거리의 점포에서는 투전·쌍륙 등 도박 도구가 일상용품으로 공공연히 팔리고 있었다.
투전의 유행은 급기야 어전(御前)에서까지 거론되었다. 정조 15년 9월19일 신기경(愼基慶)은 도박의 피해 중에서 투전을 으뜸으로 꼽으며, “위로는 사대부의 자제들로부터 아래로는 항간의 서민들까지 집과 토지를 팔고 재산을 털어 바치며 끝내는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 도적 마음이 점차 자라게 됩니다”하고, 투전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자도 엄히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투전의 유행을 금할 수는 없었다. ‘포도청등록’을 보면 도박에 관한 기사가 적지 않은데, 1860년 투전의 갑자골·가귀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이후, 1863년·1864년·1865년 등 해마다 금령이 반복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후 투전은 19세기 말 화투가 수입될 때까지 도박계의 패권을 차지하였으며, 화투 수입 뒤에도 화투의 놀음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영향력은 지금도 미약하나마 ‘족보’와 ‘땡’에 남아 있다.
하필이면 조선후기에 이처럼 도박이 성행했던 것일까. 도박의 성행 역시 사회현상인 바 그것은 조선후기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는 조선후기 경제성장. 이미 식상할 정도로 지적된 조선후기 화폐의 통용, 상업의 발달, 그리고 농업생산량의 증가 등은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소비생활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도박의 성행은 이러한 소비수준의 향상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발달은 소비의 증가를 초래했는데 도박 역시 소비의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앞서 시정공간에서 주로 중간계급 중심으로 도박이 성행하였다고 한 바 있는데, 이들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소비하는 인간의 등장
조선후기의 경제발전은 직접적으로는 상업 관련자(상인, 역관)와 또 이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중간계급에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상업자본 등으로 재투자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
전자는 이미 상식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소비란 주로 조선후기 관찬사료에서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음식·거주(건물)·복식 등의 사치가 되겠지만, 꼭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서화 골동 등 예술품의 수장(특히 북경에서 수입), 오가 서적의 집적, 그리고 음악 등에 대한 애호는 모두 조선후기 소비수준의 증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도박 역시 이러한 소비적 풍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간계급에 새로운 인간형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생산하는 인간이 아니라 ‘소비하는 인간’이다. 줄여서 ‘소비인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인간형은 18, 19세기 문학이 비상하게 주목했던 바다(이제까지 역사와 문학사 연구가 생산하는 인간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소비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⑴ 이 잡자식이 돈만 없으면 사람될 짓 초를 잡다가도 돈 곳 보면 도로 미쳐 일일장취 농창치며 안팎 사랑 친구 벗님 출일상종 못난이와 잡기 노름하는 분네 열냥내기 대강치기, 닷냥내기 수투전에 백냥내기 쌍륙치기, 가구놀음 순부동을 주야로 일삼으니, 사천 냥 넘는 돈을 사흘 만에 다 없애니 세상의 이런 잡놈 산화로 난 놈인가, 실성발광 미쳤는가.
⑵ 춘풍이 오입하며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 오입쟁이와 한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며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 활쏘기와 장악원 풍류하기, 산영에 바둑두기, 장기·골패·쌍륙·수투전·육자배기·사시랑이·동동이·엿방망이 하기와, 아이보면 돈주기와, 어른 보면 술대접하여,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좋은 일면주며 벙거짓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 노닐 적에, 청루미색 달려들어 수천 금을 시각에 없이하니, 천하 부자 석숭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⑴은 앞서 들었던 ‘게우사’의 한 부분이고, ⑵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춘풍전’의 일부다. 이 소설의 주인공 ‘무숙이’와 ‘이춘풍’은 상인 내지는 신흥중간층으로 모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두 소설의 내용인즉, ‘무숙이’와 ‘이춘풍’이 축적한 재산을 끊임없이 소비하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이들과 도박의 관계가 짐작이 가는가.
화폐의 유통 역시 도박의 성행에 큰 몫을 하였다. 화폐는 도박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질적 가치를 단일한 단위로 환원하였는데, 이것은 도박의 실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편리를 제공하였다. 다른 예를 들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화투가 거대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성행했던 데에는 금속화폐보다 액면가가 높은 지폐의 유통이 일조를 했다고 한다.
“주색잡기는 남아의 상사”
도박의 성행은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부의 축적, 화폐의 유통 등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경제적 후진국에서도 도박은 얼마든지 유행할 수 있으며, 또 사실이 그렇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도박을 화폐경제의 발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요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박은 불확실성을 원리로 하여 작동되는 게임이라고 했다. 생각할 수 있는 몇몇 변수로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도박의 성행은 사회 자체의 불확실성과 놀라울 정도의 상동성을 갖는다.
가사 ‘우부가’를 인용한다.
사람마다 도적이오 원(怨)하나니 산소(山所)로다 / 천장(遷葬)이나 하여 보며 이사나 하여 볼까? / …… / 주제넘게 아는 체로, 음양술수(陰陽術數) 탐호(貪好)하여 / 당대발복(當代發福) 구산(求山) 하기 피란(避亂)곳 찾어가며 / 올적 갈적 행로상(行路上)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우부가’ 주인공의 삶은 불안하다. 사람마다 ‘도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란곳’을 찾아다니며 ‘올적 갈적 행로상에 처자식을 흩어놓고’, 이 일에 가산을 소모한다. 이들의 행태는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피란곳’이란 무엇인가? 멀리 임병양란을 들 것도 없이 18세기 이후의 잦은 정변(政變)과 이인좌(李麟佐)의 난(亂)과 같은 봉건권력층 내부 반란, 그리고 장길산(張吉山)으로 대표되는 군도(群盜)의 횡행, 전에 없던 전염병(장티푸스, 콜레라)의 유행, 과도한 수탈,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민중저항(民亂), 홍경래(洪景來)의 난, 이양선(異樣船)의 출몰, 유언비어의 유포, ‘정감록(鄭鑑錄)’과 같은 비기류(秘記類)의 유행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으며 풍수론(風水論)은 사회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할 곳을 찾게 하였으니 ‘피란곳’은 바로 그런 곳을 일컫는다.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개인의 삶을 전혀 예측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과연 도박과 상동적 관계에 있는가? 도박에 골몰했던 이춘풍의 말을 들어보자. 이춘풍은 도박에 골몰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내에게 이렇게 답한다.
“자네 내 말 들어보소. 사환 대실이는 술 한잔을 못 먹어도 돈 한푼을 못 모으고, 이각동이는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을 못 면하고, 탑골 북동이는 투전·골패 몰랐어도 수천 금을 다 없애고 굶어 죽었으니, 일로 볼작시면 주색잡기 하다가도 못 사는 이 별로 없네. 자네 차차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술 잘먹는 이태백도 노자작(횚酌)·앵무배(鸚鵡盃)로 백년 삼만 육천일 일일수경삼백배(一日須傾三百杯)에 매일 장취하였어도 한림학사(翰林學士) 다 지내고, 자골전 일손이는 주색 잡기 하였어도 나중에 잘 되어서 일품 벼슬 하였으니, 일로 볼지라도 주색잡기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常事)로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이춘풍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예측불가능하다. 이춘풍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인과적 필연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다. a란 조건에 대해 A란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춘풍의 발언은 반사회적이고 가치전도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의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춘풍의 사고는 도박의 불확실성이란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사고가 이춘풍만의 것인가. 한 예를 더 들어보자. 19세기 문인인 최태동(崔泰東·1844~1877)은 ‘주·색·잡기(도박)’에 대한 세 가지 물음이란 뜻의 ‘삼문(三問)’이란 흥미로운 글을 남겼다. 그 중 도박에 관한 부분에서(이 작품은 도박꾼과 작자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도박꾼은 중국 역대의 탁월한 문인들이 그들의 빼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상기시키고 각고의 노력으로 문학을 전공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니, 남들이 기한에 떨 때 비단옷과 고량진미를 먹을 수 있으며 배우기에도 아주 쉬운 이 기술(도박, 곧 투전)을 배우라고 권한다.
이 권고에 대해 작자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도박의 일반적 폐해를 들어 반박하지만, 그것은 도박의 폐해이지 애초 제기되었던 물음, 재능있는 인간들이 왜 사회적으로 좌절·실패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니다.
예컨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절대적 가치인 관료로서의 출세는 과거라는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과거는 이미 체제가 약속한 프로그램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최태동의 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정비례하지 않는, 사회적 성취란 부등식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의 답은 도박꾼을 설득할 수 없다. 이춘풍 등의 세계관은 불확실성에 운명을 맡기는 도박의 세계관이며, 이 불확실성에 대한 신념은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는 도박의 원리인 불확실성은 조선후기 사회의 불확실성과 상동관계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두 불확실성의 접점을 세계관과 의식의 차원에서 찾았을 뿐 구체적인 사회현상을 들어 지적한 것은 아니다. 도박도 일종의 경제활동이니 내친 김에 경제적 현상에서 도박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다시 ‘우부가’를 참고한다.
기인취물(欺人取物)하자 하니, 일갓집에 부자(富者) 없고 / 뜬 재물 경영(經營)하고 경향(京鄕)없이 싸다니며, / …… / 부자나 후려볼까? 감언이설(甘言利說) 꾀어보세. / 언(堰)막이며 보(洑)막이며, 은(銀)점이며 금(金)점이며
‘우부가’의 ‘개똥이’ 등은 재산을 다 날리자 ‘언(堰)막이’ ‘보(洑)막이’ ‘금점’ ‘은점’으로 부자에게 사기를 치기로 한다.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을까? ‘언막이’ ‘보막이’부터 살펴보자. 앞서 인용했던 윤기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이(利)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제언(堤堰)을 쌓아 논을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 하며, ‘아무 곳에 공지(空地)가 있어 보(洑)를 만들 만한데, 만약 몇백민(緡·돈꿰미)만 들이면 몇 만석 추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참으로 이(利)가 있는 까닭에 돈이 있는 자는 다소를 가리지 않고 스스로 물주(物主)가 되며, 빚을 놓은 사람은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 토지를 팔곤 한다.”
수리가 용이한 공한지에 제언을 쌓아 논으로 만드는 것이 ‘언막이’ ‘보막이’인 바, 그 이면에는 “몇백민(緡)만 들이면 몇만석 추수를 얻을 수 있다”는 소액 투자에 최대한의 다액 보상이란 도박의 원리가 작동한다.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더러 오르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에서 김선달이 대동강 얼음 위에 짚을 썰어 두고 논처럼 보이게 하여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유포된 것이다.
은광 개발 열기도 일어
‘금점(金店)’ ‘은점(銀店)’은 금광·은광의 개발로 한몫 보려는 것이다. 금점·은점, 곧 금광·은광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은은 북경 무역의 주 결제수단이었는데, 일본과의 무역에서 받은 멕시코 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18세기 초반부터 일본이 중국과 직교역을 함으로써 중개무역이 위축되고 일본으로부터의 은 유입량이 격감하자 국내 은광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금광·은광의 개발은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이어서 불법채광인 잠채(潛採)가 유행했다. 조선후기에 금광 은광의 개발과 언막이 보막이가 대대적으로 성행했음은 남공철의 “세상에서 부랑(浮浪)한 파가(破家)의 자제라고 일컫는 자들은 늘 ‘광산을 개발하고 제언을 쌓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어울려 애를 쓰며 종사하는 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말에서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南公轍, 同知中樞府事安君墓誌, ‘金陵集’3, 國學資料院 1992).
이제 정말 이에 종사했던 인물을 예로 들어보자. 남공철이 쓴 ‘동지중추부사안군묘지(同知中樞府事安君墓誌)’의 주인공 안명관(安明觀)이 그 적실한 예가 됨직하다. 이 묘지(墓誌)는, 묘지란 장르가 일반적으로 대상인물을 미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상인물의 타락과 몰락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다.
“(안명관은) 사람됨이 호탕하고 시여(施與)를 좋아하였으며, 남을 자기처럼 믿었다. 복식(服飾)과 안마(鞍馬·안장을 얹은 말)를 호사스럽게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이 때문에 가산이 거듭 줄어들었다.”
안명관은 이춘풍이나 무숙이와 마찬가지로 호기와 사치로 재산을 소모한다. 이 묘지는 서두의 짤막한 도입부를 제외하고는 안명관의 두 가지 행각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행각이란 다름아닌 은광개발과 ‘언(堰)막이’다.
안명관은 남의 말을 듣고 ‘가옥 1구(區)’와 ‘전지(田地) 이백경(頃)’을 팔아 수천금을 마련해 은광개발에 뛰어든다. 그러나 아무리 갱을 깊이 파도 은은 나오지 않았고, 약간 나온 은도 순도가 낮아 파산하고 만다. 그는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 뒤 안명관은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의 침수지에 제언(堤堰)을 쌓아 논으로 만들면 오백 두 곡(斛)을 수확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여 화협공주방(和協公主房)의 도도(圖睹)와 호조(戶曹)에서 빚을 내 언막이에 뛰어들지만, 부근 묘지를 침수시킨다는 고발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쌓았던 제언도 홍수에 무너져 다시 한번 파산한다.
언막이 등은 그 자체가 도박은 아니다. 그러나 ‘우부가’의 주인공과 안명관의 언막이·광산개발 등이 사기와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성실한 노동과 합리적 경영을 생략하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노리는 도박의 원리에 철저히 의지한 것이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도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것이었다. 도박의 원리는 조선후기인들의 의식과 경제활동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인들은 합리성이 아닌 비합리성과 확실성이 아닌 불확실성의 바다에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 인간은 모두 합리성과 확실성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닐까?
우연과 불확실성이 똬리를 튼 세상
지금도 도박은 성행한다. 그러나 체제는 개인적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도박은 ‘심심풀이’(이것의 한계가 어디인지 의문이다. 돈 많은 인간들은 수억, 수십억 원을 심심풀이로 여길 수 있다)를 넘는 순간 불법이 된다. 왜 도박을 불법화하겠는가? 체제는 도박을 용인하지 않는가?
반대다. 수익이 큰 이 장사를 왜 외면하겠는가? 국가는 오로지 도박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이 허락한 도박 외의 것은 모두 금지한다. 대표적인 것이 복권과 경마다. 고스톱은 금지하지만 복권과 경마는 장려한다. 특히 후자는 ‘레저’란 이름으로 권장한다. 복권은 체제에 의해 합법화된 도박의 전형이다.
증권도 권장되는 도박이 아니겠는가? 증권은 자본주의의 꽃이라지만, 실제 핀 꽃은 흉측한 데다 악취를 풍긴다(시세차익을 노려 덤비는 인간들의 추태를 상상해 보라). 체제는 증권 도박을 합법화한다. 증권회사는 도박장이며, 증권회사 직원은 딜러다. 증권의 특징은 아무도, 주가의 등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등락이 예측가능하다면 증권시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이 그렇듯이 증권 역시 자신의 테크닉으로 돈을 딸 수 있다고 믿게 한다. 사기도박이 있듯이 증권에도 불법거래가 성행한다.
지금보다 도박이 성행한 시대는 없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로 나는 도박의 두 가지 원리 중 후자를 들겠다.
그렇게 믿고 싶을 것이며, 또 그러했다고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의심한다. 왜냐고? 내가 본 세상과 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하다. 세계의 밑바닥에는 우연과 불확실성이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얼마 전 외국 제약회사가 압력을 넣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만두었느니 아니니 하며 세상이 시끄러웠다. 속내가 어떠했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이 머리 속을 맴돈다.
약은 사람의 병을 고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병을 고치게 된 지 벌써 오래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치료제의 값이 너무 비싸 사람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에서 혈액암의 특효약 글리벡이 너무 비싸 환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딱한 사연을 들은 지 오래다. 서구의 제약회사가 개발비를 뽑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짓이다. 희귀병에 걸린 사람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약값이 비싸 결국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결국 치료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 죽는 것이다. 오로지 화폐를 향해 질주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뭔가 개운치가 않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소박한 질문에 쉽게 답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병들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의·약업은 인간의 다른 직종과 견주어 정말 특수하다. 의·약업은 병을 치료하는 직종이다. 병들지 않는 인간은 없다. 의학적 소견으로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해도 앞으로 병이 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모든 인간이 죽음이란 병으로 향해 가는 존재인 이상, 의·약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 점에서 의업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병든 인간, 그리고 병이 들 수 있는 인간이기에 의사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가 된다. 나 역시 책권이나 읽은 인간이고, 학생들 앞에서 공연히 목소리에 힘을 주고 훈시(?)하지만, 의사 앞에서는 육신을 전적으로 맡긴 초라한 ‘환자’일 뿐이다.
나는 조선시대 문헌을 뒤적이면서 의원에 관한 기록을 다소 보았다.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거니와 요즘 세상에도 같이 읽어봄직한 것 같아 소개한다.
조선초기의 복잡한 의료기관은 성종 대의 ‘경국대전’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먼저 궁중에는 TV 사극에서 숱하게 본 내의원(內醫院)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관은 임금의 약을 조제하는 기관이니, 왕을 제외한 일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전의감(典醫監)이란 곳도 있는데, 이곳은 대궐 내에 필요한 약재의 공급이나 또는 약재의 하사를 관장하는 곳이다. 역시 왕실에 관계된 의약기관인 것이다.
내의원과 전의감의 의료기술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왕과 왕비, 세자 등 왕실 가족이나 고급관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통 백성들은 병이 나면 어떻게 치료를 받았던 것인가?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란 곳이 있다. 이 두 관청은 이름부터 재미있다. 혜민서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관청이고, 활인서는 사람을 살리는 관청이다. 두 기관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경국대전’을 보면, 혜민서는 “서민의 질병을 구료(救療)”하는 기관이고, 활인서는 “도성의 병난 사람을 구료”하는 기관이었다. 이것만으로는 차이가 선명히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혜민서가 주로 일반 백성의 질병을 담당하는 관청이라면, 활인서는 주로 무의탁 병자를 수용하고 전염병이 돌 때면 임시로 병막(病幕)을 지어 환자의 간호를 담당했다.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묻어주는 일도 활인서의 몫이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런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에 ‘지방의료기관’이란 항목이 있기는 하다. 태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기간에 지방에 의원(醫院) 의학원(醫學院)을 두고 의원(醫員)을 파견했다고 하지만 이 기관들은 뒷날 종적이 묘연하다. 사실 조선시대 지방에는 서울의 혜민서와 활인서 등에 필적하는 공식적 의료기관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의원이 천시당한 사회
조선시대의 의학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상의 의료기관을 들고, 또 세종 시대에 엮어진 의학서적(‘향약집성방’과 ‘향약채취월령’과 ‘의방유취’)을 언급한다. 그리고 여기에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李濟馬)의 ‘동의수세보원’을 꼽으면서 찬란한 의료사(醫療史), 의학사(醫學史)를 말하지만, 나는 사실 이 점에 대해 좀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던 의료기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지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민중은 의료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 더욱이 의학서적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중이 어떻게 질병과 싸워나갔는가 하는 문제는 의료기관과 의학서적의 발달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 민중을 위해 의료활동을 했던 민중의(民衆醫)에 주목한다.
아무리 좋은 처방과 약이 있으면 무얼 하는가? 의원이 있어야 약을 쓴다. 그런데도 의원에 관한 이야기는 드물다. 양반 중심의 조선사회는 의원을 천시하였다. 의원이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학문이 있어본들 양반 아래다. 한심한 일이지만 사실인 걸 어쩌랴. 조선후기 지식인 이규상(李奎象)은 이렇게 말한다.
“대저 역학(譯學)이나 의학(醫學)에 모두 학(學)이란 말이 붙는 것은 글을 알아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글을 알면 지식이 생기는 법이니, 사역원(司譯院)이나 내의원(內醫院)에 속하는 사람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다. … 의학과 역학은 참으로 인재의 큰 창고인데, 사대부들은 역관 벼슬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 방면의 사람을 들을 수 없으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민족문학사연구소 한문분과 역, ‘18세기 조선 인물지’, 창작과비평사, 1997, 190면).”
입신양명의 조선시대적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벼슬하는 것, 곧 직업관료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벼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 하고서 일부 양반만 좋은 벼슬을 할 수 있고, 양반이 아닌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한심한 일이다. 의학과 역학(외국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국가의 외교를 다루는 중차대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의관과 역관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권력의 정상부에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 의관과 역관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의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니 무슨 열의가 있어 의학이나 역학을 공부하고 발전시키겠는가? 지금도 학벌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의원을 우습게 아는 양반들의 의식 때문에 의원에 관한 기록은 그리 흔하지 않다. 도대체 중국의 화타나 편작, 서양의 히포크라테스처럼 내놓을 만한 의원이 누가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동의보감’의 편자 허준(許浚)이 있지 않냐 할 것이다. 하지만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이건, TV드라마 ‘허준’이건 그 ‘허준’이라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허준에 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한 줌도 되지 않는다. 허준은 상상력의 소산인 것이다. 나는 유희춘(柳希春, 1513~77)의 일기인 ‘미암일기초’와, 이규상의 ‘병세재언록’, 그리고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서 간단한 기록을 보았을 뿐이다. 왕조실록에도 허준에 관해 선조와 광해군에 걸쳐 100회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만, 그것은 궁중 어의(御醫)로서의 활동일 뿐이다. 우리는 소설이나 TV의 허준을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준은 왜 이토록 유명해 졌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동의보감’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갔을 때 북경의 유리창에서 팔리는 조선의 서적으로 ‘동의보감’이 유일하더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의 서적은 중국에서도 인정받은 국제적 베스트셀러였던 것이다.
“만 명을 살리면 내 일이 끝날 것”
우리는 사실 허준 개인에 대해 별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허준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무슨 졸가리가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의 ‘이계집’에 ‘침은조생광일전(鍼隱趙生光一傳)’이란 전(傳)이 있다. 침은이라고 했으니, 침술을 주로 하는 침의였던 것이다. 작품은 짤막하지만 내용은 사뭇 인상적이다.
조선시대에는 의원을 맡는 집안이 따로 있다. 원래 전문적 의원은 중인에 속한다. 양반이 의술을 익히는 경우가 있지만 양반 출신 의원을 의원으로 치지는 않는다. 중인은 의원·역관·계사(計士)·일관(日官)·화원(畵員)·사자관(寫字官) 등등 그 범위가 넓지만, 의원·역관·계사·음양관은 잡과(雜科)라 해서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중인 중에서도 지체가 높은 편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의원과 역관을 가장 높이 치는 법이다.
그런데 조광일이란 사람은 그런 의원 가문도 아니다. 홍양호의 말에 의하면 그의 의술은 옛부터 전해오는 처방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니, 제대로 된 의원 가문에서 자라났거나 의서(醫書)를 광범위하게 본 그런 의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가? 원래 정해진 의서란 없다. 병만 나으면 그만 아닌가? 그는 가죽 주머니 속에 구리침·쇠침 10개를 넣고 다녔다고 한다. 그 침으로 악창(惡瘡)을 터뜨리고 상처를 치료하였으며 어혈을 풀고 풍기(風氣)를 틔우고 절름발이와 곱추를 일으켜 세웠는데, 즉시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니 명의라 불러도 괜찮은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의술로 유명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자기 호를 침은이라 붙일 정도로 침술에 자부심을 가진 명의였으나, 돈벌이에는 아주 손방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어느 날 홍양호가 우연히 조광일의 오두막을 지나다 보니, 웬 노파가 “아들 놈이 병이 나 거의 죽게 되었으니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었다. 홍양호가 보아도 돈이 안 될 환자다.
그런데 조광일은 “그럽시다” 하면서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선뜻 길을 따라나서는 것이 아닌가.
뒤에 홍양호가 물었다. “의술이란 천한 기술이고, 시정은 비천한 곳이다. 그대의 재능으로 귀하고 현달한 사람들과 사귀면 명성을 얻을 것인데, 어찌하여 시정의 보잘것없는 백성들이나 치료하고 다니는가?”
조광일의 대답인즉 이렇다.
“나는 세상 의원들이 제 의술을 믿고 사람들에게 교만을 떨어 서너 번 청을 한 뒤에야 몸을 움직이는 작태를 미워합니다. 또 그런 작자들은 귀인의 집이 아니면 부잣집에나 갑니다. 가난하고 권세 없는 집이라면 백 번을 청해도 한 번도 일어서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이런 인간들이 싫습니다. 불쌍하고 딱한 사람은 저 시정의 궁박한 백성들입니다. 내가 침을 잡고 사람들 속에 돌아다닌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살려낸 사람은 아무리 못 잡아도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내 나이 이제 마흔이니, 다시 십 년이 지난다면, 아마도 만 명은 살려낼 수 있을 것이고, 만 명을 살려내면 내 일도 끝이 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래교(鄭來僑)가 지은 ‘백광현전(白光炫傳)’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작자 정래교도 흥미로운 사람이다. 양반은 아니고 중인에 속하는 인물인데, 중인 중에서도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시인이었으나, 신분의 장벽에 막혀 평생을 불우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가 의원의 전(傳)을 지은 것도 자의식의 반영일 것으로 생각된다. ‘백광현전’에 의하면 백광현은 종기의 외과적 치료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사람이다. 한의학은 원래 외과 수술이 발전하지 않은 의학이다. 종기의 치료도 외과적 방법에 의한 치료술이 드물었던 바, 그는 외과적 치료술을 본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종기 치료사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왔던 것이다.
백광현은 원래 말의 병을 고치는 마의(馬醫)였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원도 별 볼일이 없는데, 마의라니 지체가 형편없이 낮았던 것이다. 마의로서 그는 말의 병을 오로지 침을 써서 고쳤고 의서는 보지 않았다. 정통적인 의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침으로 말의 병을 다스리는 기술이 진보하자, 사람의 종기에도 시술해 보았더니 효험이 있었다. 그는 이내 사람의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으로 전업했고, 수많은 종기의 증상을 보면서 의술이 더욱 정심해졌다. 요즘 말로 하자면 임상경험이 풍부해졌던 것이다.
하필이면 종기인가? 지금은 종기가 나는 경우도 적고 병 취급도 않지만, 해방 전까지도 종기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큰 병이었다. 종기에 관한 한 불후의 명약인 ‘이명래고약’이 없었더라면 저승에 갔을 사람이 허다할 것이다.
종기의 역사는 장구하다. 2000년 전 사마천은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에 종기에 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남겼다. 장군 오기가 졸병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그 소식을 들은 졸병의 어머니가 펑펑 운다. 옆에 있던 사람이 장군이 종기를 빨아서 치료해 주었으니 영광이 아니냐, 왜 우느냐 하니, 어미 말인즉 저 아이의 아버지도 오기 장군이 종기를 빨아주자 감격한 나머지 전쟁터에서 돌아설 줄 모르고 싸우다가 죽었노라고, 그러니 저 아이도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종기를 한번 빨아주고 부하의 목숨을 손에 넣다니, 끔찍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라. 오늘 누가 당신의 종기를 빨아주는가?
과격한 종기 치료술
종기는 요즘 들어 흔한 병이 아니지만, 필자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큰 병이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더하다. 조선시대에 효종과 정조는 종기로 목숨을 잃었다. 제왕의 권력도 조그만 종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종기가 이토록 큰 병이다 보니, 조선전기에는 종기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종청(治腫廳)’이란 관청까지 있었다. 종기는 참으로 심각한 병이었던 것이다.
백광현의 종기 치료 장면을 보자.
독기가 강하고 뿌리가 있는 종기는 옛 처방에 치료법이 없었다. 광현은 그런 종기를 보면 반드시 큰 침을 써서 종기를 찢어 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침을 너무 사납게 써서 간혹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효험을 보아 살아난 사람이 또 많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날마다 그의 집으로 몰렸다. 광현 역시 자신의 의술을 자부하여 환자의 치료에 더욱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명성을 크게 떨쳐 그를 신의(神醫)라고 불렀다.
과격한 치료술이다. 침을 써서 절개해 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칼 같은 것으로 종기의 뿌리까지 절개했을 것이다. 외과적 방법인 것이다. 정래교는 “종기를 절개해 치료하는 방법은 백태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니, 그는 종기의 외과적 치료의 신기원을 열었던 것이다.
정래교는 백광현을 백태의(白太醫)라고 부르고 있다. 태의는 곧 어의(御醫)다. 민간의 무면허 의사 백광현이 어떻게 내의원 의관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분명하지 않다. 내의원 의관이란 원래 의과 출신들이 차지하는 법이고, 또 의과란 대개 의원을 세습하는 가문 의과중인들이 독점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의 의원이 의술이 탁월할 경우 내의원 의원이 되는 길도 열려 있다. 내의원에 소속되는 길은 두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대로 의원을 하는 집안에서 의과를 통과해 내의원 어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본원인(本院人)이라 한다. 둘째는 의약동참(醫藥同參)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대부부터 미천한 사람까지 의술만 좋으면 모두 보임될 수 있는 것이다. 백광현은 아마 후자의 길을 밟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방목(醫科榜目)에 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숙종 21년 12월9일 숙종은 백광현을 각기병을 앓는 영돈녕부사 윤지완(尹趾完)에게 보내는데, 이날 실록은 “백광현은 종기를 잘 치료하여 많은 기효(奇效)가 있으니, 세상에서 신의(神醫)라 일컬었다”라 하고 있다.
아마도 종기를 치료하는 능력 때문에 내의원에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광현이 내의원 의원이 된 것은 현종 때다. ‘현종개수실록’ 11년 8월16일에 현종의 병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내의원 의관들에게 가자(加資)를 하는데, 백광현이 거기에 처음 보인다. 그는 공이 있을 때마다 품계가 올랐고 마침내는 현감까지 지낸다. 숙종 10년 5월2일에 왕은 그를 강령 현감(康翎縣監)에 임명했다가 이어 포천 현감(抱川縣監)으로 바꾸어 임명했다.
의원이 현감이 된 것은 대단한 출세다. 사람이 이쯤 출세하면 교만해지게 마련이다. 민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의업을 시작했던 백광현은 귀한 몸이 된 뒤에도 초발심을 잊지 않았다.
그는 병자를 보면 귀천과 친소(親疎)를 가리지 않았다. 누가 부르면 즉시 달려갔고, 가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기량을 다 쏟아 환자의 상태가 나아진 것을 보고서야 그쳤다. 나이가 많고 귀하신 몸이 되었다고 게으른 적이 없었으니, 기술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랬던 것이다.
임금의 병을 고치는 귀하신 분이 되었다 하여 민중에 대한 헌신적 의료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민중의(民衆醫)로서의 모습이 약여하지 않은가? 무릇 의원이란 이래야 하는 법 아니겠는가?
종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를 좀더 해보자. 백광현이 종기의 외과적 치료술을 개발했다면, 고약으로 유명한 종의도 있다. 피재길(皮載吉)이란 사람이 바로 그인데, 역시 홍양호가 ‘피재길소전(皮載吉小傳)’이란 작품을 남기고 있다.
정조는 1793년(정조 17년)에 머리에 작은 종기가 났다. 침을 쓰고 약을 썼지만 종기는 점차 얼굴과 턱 등으로 번져나갔다. 무더운 여름철이었다. 기거동작(起居動作)이 편할 리가 없다.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종기다. 내의원에서 별별 방도를 다 썼으나 종기는 번져갔다. 이토록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 피재길의 이름을 아뢴다.
피재길은 원래 의원 가문 출신이다. 중인의 족보를 모은 ‘성원록(姓源錄)’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 가문으로서 홍천(洪川) 피씨의 가계가 나온다. 하지만 피재길의 이름은 없다(다른 載자 항렬의 인물들은 물론 있다). 이건 다분히 그의 가정적 이력과 관련이 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었던 것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의술을 전수받지 못했고, 의서는 아예 읽은 적이 없었다. 까막눈이었던 것이다.
어렵사리 의원노릇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보고 들었던 처방을 그에게 가르쳐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처방이란 것은 딴 게 아니라 고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배운 의술로 오만 가지 종기에 듣는 고약을 팔며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근본 없는 의원인 탓에 의원이란 소리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약은 잘 들었다. 양반가에서도 이 근본 없는 의원을 불러 고약의 효험을 보곤 했다고 하니, 그는 애초 양반가가 아니라 민중의 세계를 떠돌던 민중 의원이었던 것이다.
떠돌이 약장수의 벼락출세
정조는 피재길을 불렀다. 길거리의 떠돌이 고약장수가 지엄한 분을 뵙다니, 땀이 쏟아지고 온몸이 벌벌 떨린다. 말문이 막힌다. 정조는 이 약장수를 안심시킨다. “두려워말고 네 의술을 다 발휘해 보도록 하라.” 약장수는 “신에게 한 가지 써볼 만한 처방이 있습니다” 하고 물러나와 웅담을 주재료로 한 고약을 만들어 올린다.
이것이 이른바 웅담고다. 환자(정조)가 며칠이면 낫겠느냐고 하자, “하루면 통증이 가라앉고 사흘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답한다. 과연 말과 같아 사흘이 지나자 깨끗이 나았다. 명의가 따로 없다. 묵은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고마운 일이 있으랴? 왕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을 붙이고 조금 지나 전날의 통증을 씻은 듯 잊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비방이 있을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의원은 명의라 할 만하고 약은 신방(神方)이라 할 만하다. 그의 노고에 보답할 방도를 의논해 보라.”
내의원 의원들은 그를 내의원 침의(鍼醫)에 차정하고 6품의 품계를 내려 줄 것을 아뢰니, 정조는 당연히 허락하였다. 이어 나주감목관(羅州監牧官)이 되었다. 떠돌이 약장수의 벼락출세가 아닌가? ‘정조실록’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상의 병환이 평상시대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방 의원인 피재길(皮載吉)이 단방(單方)의 고약을 올렸는데 즉시 신기한 효력을 내었기 때문이었다. 재길을 약원(藥院)의 침의(鍼醫)에 임명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7년 7월 16일)
정조는 그로부터 7년 뒤(정조 24년 6월)에 종기로 죽는다. 피재길 역시 정조의 치료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효험이 없었다. 왕이 죽고 나면 치료를 담당했던 의원을 귀양 보내는 전례에 따라 피재길은 무산부(茂山府)로 귀양을 갔다가 순조 3년 2월에 석방되었다.
피재길이 정조의 종기 치료에 쓴 웅담고는 마침내 천금의 처방이 되어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니, 어떤가? 요즘 세상이라면 특허신청부터 하고 값을 턱없이 올려받아 돈벼락을 맞을 궁리부터 하지 않았을까? 다른 의원이 웅담고를 만들어 쓰면 환자야 죽든 말든 고소부터 하지 않았을까? 피재길 이야기를 하니 이명래고약이 생각난다. 이명래의 고약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얼마였던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짐작하실 것이다.
이야기가 옆으로 새지만, 정조의 치료에 참여했던 민간 의원이 또 있다. 조희룡(趙熙龍)의 ‘호산외기(壺山外記)’에 실린 이동(李同)이란 사람이다. 그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으나 역시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 사람은 정조의 치질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환부’를 부복해 들여다보느라 대머리가 되어 상투를 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지존의 항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본 것은 이동이 역사상 최초일 것이다. 이런 수고 덕에 정조의 치질이 완치되었고, 정조는 탕건을 하사하고, 아울러 호조 돈 10만 전을 내렸다. 이동도 아마 민간에서 얻은 명성으로 동참의원이 되었을 것이다.

“제 한 몸에 본디 좋은 약재를 갖추고 있거늘 무엇 때문에 다른 물건을 쓴단 말인가?”
약이 될 것 같지 않은 약재의 사용 이면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민중을 구료한다는 절실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 이동은 의과에 합격한, 정통 코스를 밟은 의원이 아니었다. 그 역시 백광현이나 피재길처럼 민간의 의원으로 출발하여 왕실에까지 알려진 경우로 짐작된다. 나는 이동의 이상한(?) 약재에서 민간요법에 숨어 있는 오묘한 약리보다는 조선시대의 공식 의료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중들의 처절한 삶의 의지를 본다.
전염병의 홀로코스트
종기도 목숨을 거두어가는 시절이었으니, 전염병이라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정조가 사망하기 1년 전인 23년에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다. 이해 전국의 사망자는 모두 12만8000여 명이었다(‘정조실록’ 23년 1월13일).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대량의 사망자는 지금 드물게 남아 있는 통계를 보아도 전염병 때문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천연두·장티푸스·콜레라는 전염병의 삼두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세 전염병의 거두는 번갈아 등장하여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1821년에서 1822년 사이에 유행했던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는 평양에 수만 명, 서울에 13만 명이다. 전국으로 따지면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1859년에서 1860년에도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때의 사망자는 40만 명이었다. 서양 중세의 흑사병(페스트)만 무서웠던 것이 아니다.
특히 정조 23년의 전염병에는 정치인들의 죽음이 눈에 띈다. 1월7일에는 김종수(金鍾秀)가, 18일 채제공(蔡濟恭)과 서호수(徐浩修)가 죽었다. 김종수는 노론의 영수, 채제공은 남인의 영수였다.
서호수는 소론가로 이 시기 권력의 중심에 있던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이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에 의해 각 당파의 거두들이 죽었고, 약 7개월 뒤에 정조가 종기 때문에 죽었다. 당쟁의 지도가 일순 바뀐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역사는 미생물이 만드는 것인가? 어쨌거나 전염병은 조선후기 민간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전염병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것은, 파스퇴르가 탄저균을 발견하고부터다. 미생물과 전염병 사이의 메커니즘이 알려진 것은 19세기 말이 되어서였으니, 발본적 치료법이란 게 있을 수 없었다.
전염병이 돌면 정부는 바빴다. 아니 바쁜 척이라도 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란 여제(?祭)를 지내는 것이었다. 국가의 의료기관,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에서 약제를 공급하는가 하면, 병막을 짓고 병자를 모아 간호했다. 이따금 전염병이 돌았던 곳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다. 전염병이 저절로 그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전염병의 구제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정조 15년과 16년 사이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을 때 황해도 재령(載寧)의 김경엽(金景燁)이란 사람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할 것을 명하는데, 이 사람은 매번 가난한 백성을 구제했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해준 것이 거의 1000명에 가까웠기에 표창을 받은 것이었다(‘정조실록’ 16년 2월28일).
명의의 전설이 탄생하는 배경
전염병이 돌면 의원에 관한 전설이 생긴다. 죽음을 앞에 둔 환자와 가족의 마음은 약해진다. 그 허약해진 심리의 대지에서 우연과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싹튼다. 난치병과 불치병을 격퇴하는 명의(名醫)의 전설은 이래서 시작된다. 적지않은 문헌과 구전은 전설상의 의원과 의술을 전하고 있다. 미신성, 비합리성을 동반하고 말이다.
유상(柳?)이란 의원이 있다. 숙종 때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숙종의 천연두를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왕은 범인과 달라 천연두에 걸리면 곤란해진다. 살아나도 얼굴이 곰보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병을 방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다. 숙종은 재위 9년(계해년, 1683년)에 천연두를 앓았는데, 유상의 약으로 수월하게 치료가 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유상은 숙종 25년 세자(뒷날의 경종)의 천연두에도 능력을 발휘하여 벼슬이 올라갔다. 유상은 양반이 아니고 감사의 얼자(孼子)였으니 의술로 꽤나 출세를 한 것이다.
임금의 천연두를 고친 유상의 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숙종실록’에는 기록이 없지만, 민간에는 기록이 있다. ‘청구야담(靑邱野談)’을 보자. 유상이 젊어 경상도 감사의 책실(冊室)로 따라갔다가 할 일도 없고 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오던 길에 어떤 집에 들러 하루를 묵는데 주인이 잠시 출타한 틈에 우연히 그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의서를 뒤적여 보게 되었다. 주인이 돌아와 허락도 없이 남의 서책을 본다고 책망을 들었음은 물론이다.
날이 새자 주인은 유상더러 빨리 출발하고 중간에서 쉬지 말라고 채근을 한다. 유상이 탄 나귀조차 바람처럼 달려 지금의 성남 판교까지 단숨에 도착했다. 판교에는 별감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임금이 천연두를 앓고 있는데,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유의원을 불러오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유의원인가를 묻고 빨리 대궐로 가자 한다. 유상이 남대문을 통과해 구리개를 지나는데, 어떤 노파가 마마를 앓고 난 아이를 업고 있었다. 무슨 약을 썼냐고 물었더니, 거진 죽게 되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시체탕(枾?湯)을 쓰라고 하여 나았다는 것이다.
유상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지난 밤에 언뜻 본 의서에도 시체탕에 관한 말이 있었던 것이다. 입궐하여 임금의 증세를 보니, 어제 본 어린아이의 증세와 같지 않은가? 시체탕을 썼더니 바로 효험을 보았다. 시체탕이 무어냐고?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니라 감꼭지 시체를 말린 것을 달인 물이다.
시체탕 이야기는 그야말로 신비스러움으로 착색된 이야기다. ‘전설의 고향’에는 나올지 몰라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야담’에는 한 가지 얘기가 더 있다. 유상이 입궐하여 진찰을 하고 저미고(猪尾膏)란 약재를 쓰기로 하자, 숙종의 어머니 명성대비(明聖大妃)가 준제(峻劑·약성이 강한 약)라며 쓸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아무리 청해도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유상은 소매 속에 몰래 약을 넣고 들어가 쓰니, 병세가 누그러졌고 이내 회복되었다고 한다. 어느 쪽이 맞는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후자가 좀더 사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전염병에 관한 의원 이야기는 제법 여럿 남아 전한다. 정조대의 문인 유한준(兪漢雋, 1732~1811)은 ‘예의홍익만전(例醫洪翼曼傳)’이란 전을 남겼다. 주인공 홍익만은 특별하게도 전염병 전문의인데 그의 인간됨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는 가슴 속에 경계를 두지 않아 성품이 툭 트였고 사람의 위급함을 보면 비록 평소 모르는 사이라도 오직 그 급한 처지를 구원하려는 인물이었다. 이런 인품이었기에 그는 임술년(1742, 영조18)과 계해년(1743, 영조19) 전염병이 돌았을 때 치료하여 살린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홍익만이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일흔쯤 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이 고장 사람이라 소개했다. 그러고는 추운 날에 피곤하실 터이니 자신의 집으로 가서 박주(薄酒)일망정 한 잔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을 건넸다. 익만이 노인을 따라 한참을 갔더니 노인은 홀연 보이지 않고, 움집에 시신 네댓이 가로 세로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그를 인도했던 노인이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던 것처럼 술 한 병이 시렁 위에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고 떠났다.
이 이야기도 전염병이 돌던 상황을 배경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전염병으로 죽은 노인이 술을 미끼로 자신을 묻어줄 사람을 이끈다는 비합리적인 설정이지만, 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홍익만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두려움 없이 묻어주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익만이 민중을 위한 의원이었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홍익만 역시 정통 의원 출신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는 홍국신(洪國藎)으로 숙종 때 비변사 서리였다. 당대의 세도가이던 허적(許積)의 명으로 문서를 기초하는데 글자를 한 자 잘못 쓰니 허적이 지적하여 꾸짖었다. 홍국신은 붓을 던지고 그렇게 글을 잘 지을 수 있다면 왜 서리가 되었겠냐고 대드니 허적이 어쩌지 못하고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홍국신은 원래 허적의 인간됨을 미워했던 것이다.
홍익만은 홍국신의 아들이다. 서리 집안 출신인 것이다. 의원과 서리는 아예 계통이 다른 집안이다. 아마도 홍익만 역시 어떤 계기로 하여 의학을 익혔을 것이다. 그가 정통적 의원 집안 출신이었다면 이런 민중의로서의 의식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한의학 부정한 정약용
홍익만의 이야기에는 전염병을 직접 치료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다산의 경우라면 약간 다르다. 정약용은 이헌길(李獻吉)이란 사람을 다룬 ‘몽수전(蒙?傳)’이란 작품을 남기고 있다. 물론 의원으로 뛰어났던 인물이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다산의 의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다산은 그야말로 백과전서파라 의학에도 적지않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대충 꼽아보면 ‘의설(醫說)’ ‘종두설(種痘說)’ ‘맥론(脈論)’ 등의 논문이 있고, ‘마과회통(麻科會通)’과 같은 천연두 치료법을 다룬 저술이 있다.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은 한의학을 부정하고 있다. 한의원에 가면 손목의 맥을 살피는 진맥부터 하는데, 다산은 이 진맥을 부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을 가지고 오장육부를 진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약간 인용해 보면 이렇다.
“하늘이 사람을 낼 적에 어찌 반드시 오장과 육부로 하여금 그 모습을 손목 위에 환히 벌여놓게 하여 사람에게 이를 진맥하게 하겠는가?”
‘육기론(六氣論)’에서는 오행설까지 부정해버렸다. 이쯤 되면 한의학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다산의 의학은 상당 부분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종두설’과 ‘마과회통’은 제너(Edward Jenner)의 종두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근시론’에서는 종래 한의학의 음양오행으로 근시 원시를 설명하던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안구의 평돌(平突)에 의해서 근시 원시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생 중에 한의사가 있다. 십 년 전에 몸이 좋지 않아 찾아갔더니 진맥을 한 뒤 약을 지어놓겠노라 하면서 앞으로 술 담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진하게 하다 보니 어느덧 늦은 오후다. 가야겠다고 하니 병원문을 닫는다. 같이 나가서 한잔 하잔다.
“야, 너 나보고 술먹지 말랬잖아!”
“의사하고 먹는 술은 괜찮아!”
어쨌거나 그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흠뻑 취했다. 그런데 이 친구 술자리에서 다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실학자라서 대단한 줄 알지만 의학 쪽은 형편없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다산의 위의 이야기를 보면 그 친구가 화를 낸 이유를 알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몽수전’의 주인공 이헌길은 정종(定宗)의 후손이고, 이철환(李喆煥)의 제자이다. 이철환은 성호 이익의 손자뻘이다. 그러니 성호학파에 속한 인물이고, 다산과도 관계가 아주 없지 않다. 다산은 어렸을 적에 천연두를 앓았는데 이헌길의 치료로 천연두를 순하게 앓았다. 오른쪽 눈썹 위에 가볍게 마마 흔적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누어졌다. 다산은 자신이 10세 이전에 ‘저작’한 시문을 모아서 ‘삼미자집(三眉子集)’이라 했으니, 마마의 흔적으로 인한 것이다.
‘몽수전’에서 다산은 이헌길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으레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뒷날 그의 행적을 보면 빈말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생김새는 미남은 아니었던 듯 다산의 기억에 의하면 이헌길은 광대뼈가 튀어 나온 데다가 코주부였다고 한다.
이헌길은 원래 의원 가문 출신이 아니다. 그는 남몰래 ‘두진방(杜疹方)’을 보고 깊이 연구한 바 있었다. 영조 51년(1775)에 일이 있어 서울에 갔더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천연두가 돌았던 것이다. 이헌길은 그들이 불쌍하였으나 상중이라 어찌할 수가 없어 묵묵히 돌아섰다. 상중이라면 이런 궂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다 홀연 깨달았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법에 구애되어 모른 체하고 떠나간다는 것은 불인(不仁)한 것이다.”
이 장면은 흡사 ‘마태오복음’의 한 부분과 같지 않은가?
예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곳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에 그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그 불구자에게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성해졌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모의하였다.(‘마태오복음’ 12장)
어느 사회나 율법주의자들은 있는 법이다. 예(禮)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이 예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헌길의 내부에 예수와 부처가 있었던 것이다. 어디 이헌길만 그러랴? 모든 사람의 속에는 예수와 부처가 있지 않은가? 찾지 않아서일 뿐이지.
이헌길이 의술을 펼치자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열흘 만에 명성이 나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문을 메우고 길을 메울 정도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알아보면 이렇다.
몽수가 문을 나가서 다른 집으로 가면 수많은 남녀가 앞뒤에서 옹호하였는데, 그 모여 가는 형상이 마치 벌레가 움직이는 것과 같았으므로 그가 가는 곳에는 뿌연 먼지가 하늘을 가리어, 사람들은 바라만 보고도 이몽수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니 유혹이 없을 수 없다. 정약용은 ‘하루는 못된 무리의 꾐으로 어느 궁벽한 곳에 가서 문을 잠그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돈을 받고 치료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사방을 뒤져 그의 거처를 찾아내었다. 사태가 심각했다. “어떤 사람은 사나운 기색을 띠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심한 자는 몽수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애써 말린 덕에 봉변을 면할 수 있었다. 이헌길은 사과를 하고 재빨리 처방을 알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음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돈이 부족해 죽는 사람들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만든 공식적인 의료기관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질병을 이겨내기란 턱도 없었다. 민중은 의료혜택에서 거의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을 보완한 것이 바로 민중의가 아닌가 한다.
현대의 인간은 질병 치료술의 부족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지구 전체를 두고 생각한다면 오염된 물로 인해 죽는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제3세계의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사망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몇 푼 하지 않는 값싼 백신이 부족해 죽는 사람이 허다하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확실한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구나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은 의술의 부족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돈의 부족으로 죽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술은 누구를 위해 있어야 하는가? 나는 홍양호의 ‘조광일전’을 보면서 이 짤막한 전기(傳記)에서 제기한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본다
사족으로 몇 마디 더. TV 드라마 ‘허준’을 보고 나는 늘 궁금했다. 유의태의 집은 마치 현대의 병원처럼 묘사됐다. 병자들이 누워 있는 곳도 있고 진료를 하는 곳도 있다. 병부잡이라 해서 병자를 인도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예쁜 간호원도 있었다. 약을 짓는 탕약실도 따로 있었다. 또 진료할 때 의원들의 복색도 평복과는 달라 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조선시대 산청(山淸)과 같은 오지 시골에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또 서울의 혜민서를 마치 병원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PD의 상상력의 소산인가? 아니면 무슨 근거라도 있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 찬찬히 따져볼 일이다

노동이 없으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노동하기보다 놀기를 좋아한다.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지만, 인간은 그 신성한 일만으로 일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노동만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따분하고 비인간적일 것인가? 아니,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노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의 반이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노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노는 인간과 노는 문화가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퍽 궁금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책에서도 인간 삶의 반을 이루는, 역사의 절반이 될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의 이 글은 우리나라 역사의 절반(?)에 대한 탐구의 시작이다.
놀이문화 소개하는 노래
‘한양가’란 가사가 있다. 1848년경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이 가사는 국문학 연구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19세기 중반 서울 시정의 활기찬 동태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한양가’는 당시 신분과 사회적 처지에 따른 한양의 각계각층이 즐기던 온갖 놀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바,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자료다.
화려가 이러할 제 놀인들 없을소냐/장안소년 유협객과 공자왕손 제상자제/부상대고 전시정과 다방골 제갈동지/ 별감 무감 포도군관 정원사령 나장이라/남북촌 한량들이 각색 놀음 장할시고/공물방 선유놀음 포교의 세찬놀음/ 각사 서리 수유놀음 각집 겸종 화류놀음/ 장안의 편사놀음 장안의 호걸놀음/재상의 분부놀음 백성의 중포놀음/각색 놀음 벌어지니 방방곡곡 놀이철다
공자 왕손으로부터 돈 많은 시전상인을 거쳐 의금부 나장까지 온갖 계층이 모두 유흥을 벌인다. 놀이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나는 이 놀이의 내용을 알기 위해 10년 이상 무척 애썼지만, 아직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놀이를 소개한 뒤에 각별히 관심을 끄는 별감(別監)의 ‘승전(承傳)놀음’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다른 놀음은 모두 이름만 소개되어 있으나, 승전놀음은 ‘한양가’ 전체 서술량의 약 1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구체적인 놀이 과정을 길게 묘사하고 있다. 별감들이 기생과 가객(歌客), 금객(琴客)을 불러 기악(器樂)과 노래, 춤으로 벌이는 거창한 놀이판인 승전놀음이 조선후기 서울의 놀음판 중에서 으뜸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승전놀음의 주최자인 별감이다. 별감에 대해서는 ‘검계(劍契)와 왈자(‘신동아’ 2002년 11월호 참조)를 다루면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대전별감은 왈자의 하나로 조선후기 유흥계의 주역이었다. 나는 그 동안 이런 글 저런 글에서 별감의 존재에 대해 주목해왔다.
역사란 항상 승자의 것이란 말이 있듯, 조선의 사회적 승자는 양반계급이었기에 역사 서술의 주 대상도 늘 양반이었다. 민중사관은 양반의 대타적 존재인 민중을 역사서술의 주 대상으로 삼지만, 이도저도 아닌 중간부류들은 늘 잊혀지게 마련이다. 별감 같은 부류가 그 짝이다. 나는 이 글에서 별감을 서술 대상으로 불러내고자 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별감이란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은 여럿이다. 유향소(留鄕所)의 좌수(座首) 다음가는 자리를 별감이라 부르고, 또 하인들끼리 서로를 별감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용례와는 다른 궁중의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별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딱딱하지만, 먼저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들추어보자.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잡직(雜職)조’에 액정서란 관청이 있다. 액정서의 임무는 이렇다.
‘왕명의 전달과 알현(謁見, 傳謁) 및 왕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의 공급, 궐문 자물쇠와 열쇠의 관리,
궁궐 내정(內庭)의 설비 등의 임무를 맡는다.’
첫째 임금의 명을 전달하거나 임금을 알현하는 일을 중간에서 대신 전하는 일, 그리고 임금이 사용하는 붓과 벼루를 간수하고 대령하는 일로 주로 임금과 관계된 일이다. 그 다음이 대궐의 관리에 관계된 일이다. 즉 대궐 안에 있는 온갖 문의 열쇠, 자물쇠를 관리하고, 궁궐 마당에 무언가 설치하는 일을 도맡는다. 이런 일들은 문필(文筆)에 관계되는 양반들의 관직과는 달리 몸을 부려서 하는 육체노동에 해당한다.
하지만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일이기에 이들의 위세는 어지간한 양반 못지않다. 때문에 이들 역시 위세를 떨 수 있었던 것이다.
별감은 액정서에 소속된다. 위의 ‘경국대전’에서 ‘왕명을 전달한다’ 해서 꼭 왕에게만 소속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별감은 왕비와 동궁에게도 소속돼 있다. ‘경국대전’의 ‘형전(刑典)’ ‘궐내(闕內) 각차비(各差備)’에 별감의 수가 나와 있는데, 대전(大殿, 王)의 별감은 46명, 왕비전 별감 16명, 세자궁 별감 18명, 문소전(文昭殿) 별감 6명으로 모두 86명이다. 이 중 문소전 별감은 곧 없어졌으니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별감의 수는 문소전 별감을 제외하면 80명이다. 연산군 때 120명이 된 적이 있고 인조 때 150명으로 증가한 적도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일로 생각된다.
별감의 수는 영조대의 ‘속대전’에 와서 약간 바뀌는데, 다른 변화는 없고 세손궁 별감 10명이 추가된다. 이것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죽자, 손자인 정조가 세손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별감은 액정서의 지휘 아래에 있으니, 먼저 액정서의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자.
‘정6품 사알 1명, 사약 1명/종6품 부사약 1명/정7품 사안 2명/종7품 부사안 3명/정8품 사포 2명/종8품 부사포 3명/정9품 사소 6명/종9품 부사소 9명’
복잡한 설명을 간단히 줄이면 이렇다. 정6품과 종6품의 사알, 사약, 부사약은 오로지 대전(왕) 소속이다. 정7품 사안 2명부터는 왕비전과 세자궁 소속이다. 그리고 정7품 사안까지는 완전히 독립된 위계지만, 종7품 부사안부터는 별감들이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는다. 즉 종7품 봉무랑(奉務郞)이 별감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급이다. 요컨대 액정서를 채우는 주 세력은 별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는 존재’로 주목받은 별감
흥미로운 것은 관직 이름을 보면 이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알(司謁)의 ‘사(司)’는 관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알은 ‘알현’을 관장한다, ‘사약(司쿫)’은 자물쇠를 관장한다, ‘사안(司案)’은 ‘서안(書案)을 관장한다, ‘사포(司圃)’는 채소밭, 혹은 꽃밭을 관장한다, ‘사소(司掃)’는 청소를 관장한다는 뜻이 된다. 이름만 들어도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별감은 그들의 직무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시정에서의 행각이 별감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별감은 ‘노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앞서 왈자에 대해 언급했을 때 왈자의 한 부류로 별감을 들었다. 별감이 왈자의 한 부류가 된다는 것은 조선후기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보자. ‘관우희(觀優戱)’란 문헌이 있다. 송만재(宋晩載)란 사람의 아들 송지정(宋持鼎)이 1843년 과거에 합격을 하였다. 과거에 합격하면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는 법이고, 또 광대패를 앞세워 각종 놀음판을 벌이게 마련인데, 송만재는 집안이 가난하여 광대패를 부를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광대패의 연희(演戱)를 50수의 시로 읊어 아들의 과거 합격을 축하했던 것이다. ‘관우희’가 바로 그 작품이다.
‘관우희’는 판소리, 줄타기, 땅재주 등 당시 광대패가 공연했던 레퍼토리를 소개하고 있어 국문학과 민속학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은 판소리 열두마당을 소개한 부분이다. 그 열두마당을 시로 읊고 있는데, 그 중 ‘왈자타령’을 읊은 시에 “遊俠長安號曰者, ?衣草笠羽林兒”란 구절이 있다. “장안의 유협을 왈자라 하나니, 천의(?衣) 입고 초립(草笠)을 쓴 우림아(羽林兒)로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천의와 초립이란 말이 비상하게 중요한데, 이는 다름아닌 별감의 복색을 형용한 것이다. 천의(?衣)의 ‘천(?)’은 꼭두서니를 말하는 바, 꼭두서니는 붉은색의 염료로 쓰인다. 즉 붉은 색 옷이란 뜻이다. 초립은 문자 그대로 초립인데, 붉은색 웃옷과 초립은 별감의 복색이다. 별감은 흰 옷을 입고 외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의초립이라 하면 바로 별감을 가리킨다. 우림이란 말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액정서 별감을 지칭한다.
유협이란 말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유협은 다름아닌 협객이다. 협객이란 무엇인가? 연암 박지원은, “힘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 ‘협(俠)’이라 하고, 재물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고(顧)’라고 한다. 고일 경우 명사(名士)가 되고, 협일 경우 전(傳)으로 남는다. 협과 고를 겸하는 것을 ‘의(義)’라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협객이며 협은 무력을 바탕으로 삼는 행위다. 사실 의협적 행동과 폭력은 남을 돕느냐, 아니면 남을 착취하느냐의 방향만 다를 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무력적 성격에 주목하여 유협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왈자는 폭력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했는데, 별감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이들의 행동은 실로 윤리도덕과는 상관없이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의 친척 두들겨팬 별감
‘왕조실록’에는 이들 별감에 관한 자료가 적지 않은데, 대개는 술을 먹고 소란을 떨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관계된 것들이다. 다음은 숙종 35년 3월25일 사헌부가 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별감 송정희(宋鼎熙) 등 6, 7명의 불량배들이 술과 고기를 차려놓고 창녀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면서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왁자하게 놀고 있어, 사헌부의 금리(禁吏)가 체포하려고 하자 금리를 구타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창녀의 집이란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방으로 짐작된다. 이 자료는 별감들이 기방의 주 고객이었음을 증언한다. 아울러 그들이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가진 부류임을 증언한다.
이들의 폭력적 행동의 사례는 종종 보고되는 바다. 영조 43년 7월29일 액예(掖庭署 下隷란 뜻, 곧 별감을 가리킴)가 야음을 타서 의녀(醫女)를 결박한 뒤 치마를 벗기고 추행한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별감이 기생 노릇을 하는 의녀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숙종 38년 10월20일 형조판서 박권(朴權)이 보고한 별감 김세명(金世鳴) 사건은 별감이 폭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별감 김세명은 능소(陵所)에서 적간(摘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종실인 원흥(元興) 수(守) 이후(李煦)는 김세명의 인사를 받고도 답배를 하지 않았다. 화가 난 김세명이 욕을 하자, 이후는 김세명의 입에 오물을 집어넣고 난타하였다. 종실이라면 임금의 친척이니 별감과는 지체를 논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 종실이 별감의 입에 오물을 집어넣고 난타한 것은 인정에 벗어나는 일이지만, 신분사회였으니 또 이해할 수가 없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세명은 동료 20여 명을 이끌고 이후의 집을 찾아가 이후를 끌어내 묶은 뒤 있는 힘을 다해 구타하여 분을 풀었다. 이후의 형 이경(李炅)이 입궐하여 이 사태를 알리려 했더니, 별감 등이 알아차리고 역시 빰을 치고 구타하였다. 별감의 폭력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결국 김세명은 절도에 전가사변(全家徙邊 :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함)되었다.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순조 16년 6월3일의 것이다. 포교들이 술 취한 무뢰배들을 잡았는데, 그 중 박몽현(朴夢賢)이란 자가 있었다. 궁중의 하인을 지냈다 하기에 석방했는데, 박몽현의 아비가 왕대비전의 별감 한 패를 거느리고 우포도대장 서영보(徐榮輔)의 집으로 들이닥쳐 포교와 포졸을 구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포교의 집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되었다.
숙종 43년 2월6일에는 별감이 금령을 범하고 밤에 나다니다가 포도청에 잡히자 같은 별감들이 나졸을 구타하고 갇힌 동료를 구출하는 사건이 있었고, 영조 51년 2월25일에는 액예와 포교가 술집에서 싸우다가 액예가 포교를 결박하였는데, 액예들이 무리를 지어 포교를 구타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별감이 통행금지를 어기고 돌아다니거나(정조 4년 12월25일),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것은 (순조 10년 4월30일) 다반사였고, 술에 만취하여 포교에게 잡히자 포교의 집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별감의 존재는 그들의 직역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주로 유흥과 술주정과 폭력, 범법과 관련해 기록에 남아 있다. 이런 인간들을 역사학에서 다룰 리가 없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무엇보다 별감이 조선후기 유흥문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런가 하면 별감은 조선후기 복식의 유행을 주도한 축이었다. 한번 살펴볼 만하지 않은가? 먼저 별감의 복색부터 보자.
별감의 생활은 사치스럽고 소비적이었던 바, 그런 생활의 특징적 국면이 잘 드러난 분야가 바로 복색이었다. 예컨대 한문 단편 ‘재회’는 그 첫머리를 “한 부잣집 아들이 외도에 빠져 가산이 많이 기울었지만, 별감이 된 까닭에 의복이 매우 화려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한양가’가 묘사하고 있는 별감의 패션을 보자.
별감의 거동 보소, 난번별감 백여 명이/맵시도 있거니와 치장도 놀라울 사/편월상투 밀화동곳 대자동곳 섞어 꽂고/곱게 뜬 평양 망건, 외점박이 대모관자/상의원 자지팔사, 초립 밑에 팔괘 놓고/남융사 중두리의 오동입식 껴서 달고/손뼉 같은 수사갓끈 귀를 가려 숙여 쓰고
난번별감이란 교대근무를 마치고 나온 별감이다. 이들의 복색을 머리부터 살펴보자. ‘편월상투’의 ‘편월’은 조각달이다. 상투를 그냥 뭉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낱낱이 펴고 빗질을 해서 조각달처럼 보이게 모양을 낸 상투다. 동곳은 상투가 풀어지지 말라고 꽂는 것인데, 여기도 사치를 한다. ‘밀화동곳’의 밀화는 호박인데, 누런 호박은 마치 꿀이 엉긴 것 같다 하여 밀화라고 부른다. 여성들의 노리개, 단추, 비녀, 장도와 남자들의 갓끈을 만드는 데 쓰는데, 상당한 사치품이다(대자동곳은 大字동곳으로 보인다. 아마도 큼직한 동곳인 듯).
상투를 짰으면 망건을 쓴다. 망건은 상투를 튼 머리에서 머리털이 흩어지지 말라고 동여매는 것이다. 곱게 짠 ‘평양망건’을 쓴다고 했는데, 망건은 원래 이마 쪽 부분을 외가닥으로 짜서 이마가 훤히 비치게 한 것이 고급품이다. 곱게 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일 터. 평양망건은 아마도 평양에서 만든 망건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든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은 정조 이후 가장 명예로운 벼슬이었던 규장각 각신이 쓰는 와룡관을 왕명을 받아 제작했던 곳이니, 머리에 쓰는 물건의 제작으로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사치스러운 초립 장식
‘외점박이 대모관자’란 무엇인가. 망건에는 망건을 죄는 당줄이란 줄이 있는데, 이 줄을 꿰어 거는 것이 관자다. 관자는 신분에 따라 재료가 다르다. 보통 관원은 옥관자를 달다가 정3품 당상관이 되면 금관자를 달고, 정2품이 되면 다시 옥관자를 다는데, 이때의 옥은 특별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만들고 따로 도리옥이라 부른다.
벼슬아치가 옥관자를 달면 나으리, 금관자를 달면 영감, 도리옥을 달면 대감이라 부른다(그 위는? 상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관자도 옥관자도 아닌, 대모관자다. ‘대모’는 누런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바닷거북의 등딱지다. 안경테, 담뱃갑, 갓끈, 장도, 풍잠 등 장신구나 생활용품의 재료로 쓰이는데 아주 고급품으로 친다. 외점박이 대모관자란 검은 점이 하나 강조되어 있는 대모로 만든 관자다. 특히 더 고급으로 치는 것이다. 별감은 옥관자 금관자를 달 일이 없는 사람이므로 대모로 만든 관자로 사치를 했던 것이다.
상투를 짜서 동곳을 꽂고 망건을 둘렀으면, 이제 모자를 쓸 차례다. 별감이 특별하게 만든 초립을 쓴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상의원 자지팔사, 초립 밑에 팔괘 놓고”란 부분이 바로 초립의 치레를 말한 부분인데, ‘팔괘 놓고’란 부분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상의원 자지팔사’란 상의원에서 만든 8가닥(八條)의 실로 꼰 자줏빛 끈이란 뜻이다.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궁중의 보물을 맡아보던 곳인데, 여기서 직조(織造)를 하기도 한다. 상의원에서 짠 고급의 직조물로 초립의 안을 받쳤던 모양이다.
‘남융사 중두리’ 역시 초립에 관계된 것이다. ‘중두리’는 가장자리다. 방의 벽과 방바닥 사이를 방중두리, 또는 마루중두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초립의 가장자리를 말한다. ‘남융사(藍絨絲)’에서, 융은 원래 감이 두툼하고 고운 모직물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남빛이 나는 융실로 만든 초립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급품이다.
이렇게 만든 초립에 ‘오동입식(烏銅笠飾)’을 단다. 초립은 꼭 별감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별감의 초립에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 별감의 초립은 대오리를 묶는 물건인 호수(虎鬚)를 좌우와 뒤에 꽂는다. 호수를 꽂으려면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가 오동입식으로 보인다. 오동은 적동(赤銅), 곧 검붉은 산화구리니, 오동입식은 산화구리로 만든 입식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초립의 사진을 보면 초립 옆에 대오리를 꽂을 수 있는 대롱 같이 생긴 물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한다. 초립을 썼으면 끈으로 턱에 묶어서 고정시켜야 하는데, 그 끈이 수사갓끈이다. 수사(繡紗)는 수놓은 비단갓끈으로 역시 고급품이다.
이제 옷치레를 보자.
다홍생초 고운 홍의 숙초창의 받쳐 입고/보라누비 저고리에 외올뜨기 누비바지/양색단 누비배자 전배자 받쳐 입고/금향수주 누비토수 전토수 받쳐 끼고 홍의(紅衣)는 별감만이 입을 수 있는 별감 특유의 옷이다. 이것은 다홍색의 생초로 만든다. 생초는 생사, 곧 삶지 않은 명주실로 짠 비단이다. 홍의 안에는 ‘숙초창의’를 받쳐 입는다 했는데, 창의는 공태와 무가 없는 통소매에 양옆을 튼 보통 사람의 간단한 나들이옷이다. 이때 창의는 숙초, 곧 삶은 명주실로 짠 비단으로 만든다.
창의 속에 입는 저고리는 보라색의 누비저고리이고, 바지도 외올뜨기 누비바지다. 누비는 손이 많이 가는 것이라 사치품이다. 외올뜨기는 외올, 즉 단 한 가닥으로 뜬 망건이나 탕건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다만 ‘외올뜨기 누비바지’가 어떤 것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저고리 위에는 배자를 덧입는다. 배자는 조끼와 비슷한데, 단추가 없고 양쪽 겨드랑이 아래를 내리 터놓은 옷이다. ‘양색단 누비배자’란 것은 양색단을 감으로 쓴 누비배자란 뜻이다. 양색단(兩色緞)은 씨와 날의 빛이 다른 실로 짠 비단이다. 이것을 감으로 삼아 만든 배자에 솜을 넣어 누빈 것이니, 아주 호사스런 옷이다. ‘전배자’는 짐승의 털가죽(氈)을 안에 댄 배자를 말한다. 이 역시 호사치레다.
토시는 아는 바와 같이 저고리 소매처럼 생긴 방한구로 팔에 끼는 것이다. ‘전토시’는 전배자처럼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금향수주 누비토수’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금향(錦香)은 붉은빛을 띤 검누른 빛깔이고, 수주(水紬)는 아주 품질이 좋은 비단이다. 즉 검붉은빛의 고급 비단으로 만든 토시다.
옷만 좋게 차려 입으면 멋내기는 끝인가? 아니, 장신구가 남아 있다. 지금 세상은 남자들도 시계나 반지, 안경, 목걸이 등으로 몸을 치장하지 않는가? 예나 지금이나 멋내기의 본질은 같은 법이다. 별감은 장신구 치레도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중동치레 불작시면 우단 대단 도리불수/각색 줌치 묘히 접어 나비매듭 벌매듭에/파리매듭 도래매듭 색색이로 꿰어차고/오색비단 괴불줌치 약낭 향낭 섞어차고/이궁전 대방전과 금사향 자개향을/고름마다 걸어 차고 대모장도 서장도며/밀화장도 백옥장도 안팎으로 빗기 차고/삼승보선 순혹파서 맵시있게 하여 신고/제제창창 앉은 모양 절차도 거룩하다
‘중동치레’의 ‘중동’은 요즈음 말로 ‘중간’ ‘허리’다. 중동치레는 허리 부분의 치장이다. 대체로 허리띠, 쌈지, 주머니, 면경집 따위를 허리춤에 차는데, 이것들을 호사스럽게 하여 사치를 하는 것이다.
조선후기 패션 선도한 별감
‘우단 대단 도리불수’에서 ‘대단’은 중국제 비단이고 ‘우단’은 거죽에 고운 털이 돋게 짠 비단이다. ‘도리불수’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해볼 수는 있다. 도리(桃李)는 복숭아꽃 오얏꽃이다. 불수는 국어사전에는 없으나 이훈종 선생에 의하면(‘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2, 124면) 양손을 모아 합장하는 것처럼 생긴 밀감을 부처님 손 같다 하여 불수감이라고 하는 바, 인자하고 복을 베푸는 것을 뜻하는 무늬라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우단 대단 도리불수’는 도리나 불수 무늬를 놓은 대단 우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갖가지 줌치, 곧 주머니를 접어 나비·벌·파리 모양의 매듭이나 도래매듭(두 줄을 엇매겨 두 층으로 엮은 매듭)을 엮어 찬다는 것이다.
괴불은 괴불주머니인데, 색이 있는 네모난 헝겊을 마름 모양으로 접고 안에 솜을 통통하게 넣어 수를 놓고 색실을 단 것이다. 주머니 끝에 다는 장식용 노리개다. 괴불주머니 외에 또 약냥(藥囊)·향낭(香囊), 곧 약주머니와 향주머니를 다는데, 이궁전 대방전 금사향 자개향이 바로 약낭 향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궁전 대방전은 중국에서 수입한 향의 이름이다. 금사향 역시 중국제 향이기도 하고, 또 향을 넣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후자의 뜻으로는 은으로 만든 네모꼴의 갑에 도금을 한 뒤 한충향(漢沖香)을 넣은 것이란 뜻이다. 한충향은 보통 여자들이 노리개로 차는 향이다. 향기를 취하기도 하고 곽란 같은 급한 증세에 약으로도 쓴다. 자개향은 아마 자개로 꾸민 향을 넣은 작은 상자일 것이다.
주머니, 괴불줌치, 약낭, 향낭을 단 뒤에 장도를 단다. 장도는 은장도를 연상하면 된다.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인데, 이것 역시 사치용으로 남이 보도록 찬다. 대모장도 서장도 밀화장도 백옥장도는 모두 장도의 집을 꾸미는 재료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다른 것은 설명할 것이 없고, 서장도는 물소뿔로 만든 장도다.
별감의 복색은 사치스럽다. 비단과 전(氈)과 누비와 각종 장신구로 몸을 휘감고 있지 않은가. 과연 사치의 극을 달린다 할 만하다. 옷과 장신구의 사치는 인간의 자기표현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다. 별감의 복색에서 나는 조선후기 남성들의 복색에 대한 염원을 본다. 아마도 별감의 복색이야말로 조선후기 남성들이 가장 바라는 패션이 아니었을까.

‘한양가’ 본문을 읽어보면 서울 시정의 놀이 중에서 승전놀음을 으뜸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유흥계의 총아 별감이 주최하는 승전놀음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승전놀음에 대해 ‘한양가’ 말고는 다른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이병기 선생의 ‘가람일기’에서 어떤 노인에게서 승전놀음에 대해 들었다는 간단한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줄도 써놓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한양가’가 승전놀음에 관한 유일한 기록일 것이다.
‘승전(承傳)’이란 왕명을 전달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별감의 고유한 업무다. 그러나 ‘승전’이 ‘놀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승전이란 게 별감이 하는 일이니, 별감을 대신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승전놀음을 별감놀음이라고도 부르니 말이다.
‘한양가’에 묘사된 승전놀음은 기본적으로 연예를 관람하는 놀이다. 여기서 연예를 제공하는 부류는 가객(歌客), 금객(琴客)과 기생이다. 물론 기생이 가장 수가 많고 또 중요하다. 별감들은 기생을 대거 동원하여 거창한 놀음판을 벌였던 것이다. 대개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기생을 불러 놀음판을 벌일 수 있으나, 별감의 경우는 좀 유별났던 것 같다. 기생과 별감의 관계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고 승전놀음에 대해 살펴보자.
‘사처소(四處所) 오입쟁이’란 말이 있다. 네 곳의 오입쟁이란 뜻인데, 조선후기 서울의 기생이 소속되어 있는 관청 넷을 말하는 바, 내의원(內醫院) 혜민서(惠民署) 상의원(尙衣院) 공조(工曹)가 그것이다. 내의원의 기생이란 원래 의녀(醫女)다. 의녀의 소임을 맡으면서 동시에 기생 노릇을 했던 것이다. 혜민서 역시 마찬가지다. 상의원은 원래 임금의 의복과 대궐 안의 보물을 관리하는 곳이다. 상의원의 침선비(針線婢)는 원래 임금의 의복을 짓는 구실을 맡아 하는데, 동시에 기생을 겸업한다. 공조에도 군사들의 의복을 짓는 침선비가 있어 이들 역시 기생의 역할을 하였다. 이 중 내의원의 기생을 특별히 약방기생(藥房妓生), 상의원의 기생을 상방기생(尙房妓生)이라 한다.
원래 이들은 기생이 아니었다. 조선전기에는 따로 기생이 있었으며, 기생은 모두 장악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물론 이들을 기생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기생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장악원이 붕괴되자, 이들이 기생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사처소 기생의 성분은 다양하다. 왕실의 잔치에 지방의 기생이 올라온다. 이들은 잔치를 치르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서울에 머물기도 한다. 물론 서울 자체에서 충당되는 기생도 있다. 어쨌거나 서울의 기생은 출신은 다양하지만, 일단 이 네 곳에 소속된다. 이들의 숙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생의 영업권을 갖는 자가 기부인데, 기부는 별감, 포도군관(捕校), 승정원 사령(使令), 의금부 나장(羅將), 궁가(宮家)나 외척가의 겸인(탙人,청지기), 무사(武士)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종 때 대원군이 집정하자, 의금부 나장과 승정원 사령은 창녀의 서방이 되는 것만 허락하고 관기(官妓)의 서방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처소 기부의 내력이다.
별감과 기생의 특수 관계
사처소 기부 중에서도 가장 끗발이 있는 것이 바로 별감이며, 별감 중에서도 대전별감이 으뜸이었다. 기생은 ‘조(操)’라는 것이 있어 양반이나 부호의 명을 거스를 수는 있어도 대전별감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승지나 참판 등 고위관료 외에는 기생에게 ‘해라’를 못하고 모두 ‘하게’를 하였는데, 유일하게 액정서의 사알이나 사약은 ‘해라’를 할 수 있었다. 별감과 기생은 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승전놀음에서 별감이 수많은 기생을 불러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이제 승전놀음 이야기를 해보자. 승전놀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득공이 쓴 ‘유우춘전(柳遇春傳)’에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유우춘전’의 주인공 유우춘은 해금의 명수다. 이 작품은 높은 예술적 경지를 추구하는 유우춘과 값싼 음악을 요구하는 몰예술적 취향 사이의 갈등을 묘사한 수작이다. 몰예술적 취향의 대표적인 경우로 별감이 나온다. 임형택 교수의 번역을 보자.
또 가령 춘풍이 태탕하고 복사꽃 버들개지가 난만한 날 ‘시종별감’들과 오입쟁이 한량들이 무계의 물가에 노닐 적에 침기(針妓, 침선비) 의녀(醫女)들이 높이 쪽찐 머리에 기름을 자르르 바르고 날씬한 말에 홍담요를 깔고 앉아 줄을 지어 나타납니다. 놀음놀이와 풍악이 벌어지는 한편에 익살꾼이 섞여 앉아서 신소리를 늘어놓지요. 처음에는 요취곡(군악 계통의 곡조)을 타다가 가락이 바뀌어 영산회상이 울립니다. 이때에 손을 재게 놀려 새로운 곡조를 켜면 엉켰다가 다시 사르르 녹고, 목이 메었다가 다시 트이지요. 쑥대머리 밤송이 수염에 갓이 쭈그러지고 옷이 찢어진 꼬락서니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눈깔을 까막까막하다가 부채로 땅을 치며 ‘좋아, 좋다!’ 하며, 그 곡이 가장 호탕한 양 여기고 오히려 하잘것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우춘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과연 예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에 가까운지는 의문이나 여기서 시종별감 오입쟁이들이 침기 의녀 등 기생을 불러 풍악을 잡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승전놀음의 원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뒤의 ‘승전놀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더 이상 상고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승전놀음 구경 가자/북일영 군자정에 좋은 놀음 벌였구나/눈빛 같은 흰 휘장과 구름 같은 높은 차일/차일 아래 유둔 치고 마루 끝에 보계판과 아로새긴 서까래에/각 영문 사촉롱을 빈틈없이 달아놓고/좁쌀구슬 화초등과 보기 좋은 양각등을 차례 있게 걸어놓고/난간 밖에 춘화 가화 붉은 비단 허리 매어/빙문 진 유리병에 가득이 꽂아 놓고/각색 총전 몽고전과 만화등매 담방석에/백통 타구 옥타구며 백통 요강 은재떨이/왜찬합 당찬합과 아로새긴 교자상과/모란병풍 영모병풍 산수병풍 글씨병풍/홍융사 구멍 뚫어 이리저리 얽어매고
북일영은 경희궁 북쪽에 있던 훈련도감의 분영이다(군자정은 미상). 먼저 이 놀이판의 차림새를 보자. 원래 사치스러운 별감의 놀이인 만큼 놀이판의 차림도 호사스럽다. 먼저 휘장을 치고 햇볕을 가리느라 차일을 높이 쳤다. 그 아래에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자리인 유둔(油芚)을 깔고, 마루 끝에 보계판(補階板)을 깔았다. 보계판은 좌석을 넓히기 위해 마루에 덧댄 판목을 이르는 말이다.
화려한 잔치 마당
아로새긴 서까래는 아마도 단청을 올린 서까래일 것이고, 거기에 각 영문(營門)에서 가져온 사촉롱(紗燭籠)과 양각등(羊角燈)을 곳곳에 달아매었다. 사촉롱은 여러 빛깔의 비단을 겉에 씌운 등롱이다. 등롱이란 대나무나 철사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종이나 비단으로 겉을 바른, 들고 다닐 수 있는 등이다. 양각등은 양의 뿔을 불에 쬐어 투명할 정도로 얇게 편 뒤에 그것을 등롱에 씌운 등이다. 화초등은 아마도 꽃모양으로 만들거나 꽃모양을 그린 등인 듯하다. 다만 이 앞에 붙어 있는 좁쌀구슬과 화초등의 관계가 어떤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온갖 등을 단 뒤에 꽃으로 장식을 더한다. 춘화 봄꽃과 가화, 즉 조화를 붉은 비단으로 묶어 빙문(氷紋)이 진 유리병에 꽂아둔다. 유리병의 무늬가 얼음무늬와 같다는 것으로 곧 유리병에 꽃을 꽂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이 앉을 자리도 호사스럽기 짝이 없다. ‘각색 총전 몽고전과 만화(滿花)등매 담방석’은 관람하는 사람들이 앉을 방석 종류를 늘어놓은 것이다. 총전과 몽고전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전(氈, 짐승의 털로 짠 피륙)으로 만든 따뜻한 고급 방석이다. 만화는 만화석(滿花席), 곧 꽃무늬를 넣어서 짠 왕골 방석이고, 등매는 가장자리를 검은 헝겊으로 두른 돗자리를 말한다. 담방석은 짐승털로 짠 방석이다. 이렇게 호사스런 자리를 깐 다음, 백동(白銅)과 옥으로 만든 타구와 요강과 은재떨이를 갖추었다.
이런 잔치에 먹는 즐거움이 없을 수 없다. 교외에 나왔으니 당연히 먹을 것은 찬합에 담아 온다. 일본에서 수입한 왜찬합(倭饌盒)과 중국제 당찬합(唐饌盒)을 쓰고, 번듯한 교자상에 올린다. 잔치상 뒤로는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병풍, 새를 그린 영모병풍, 산수화를 그린 산수병풍과 붓글씨로 된 글씨병풍을 두르되, 혹 넘어질까 보아 구멍을 뚫어 홍융사로 묶어둔다.
이제 놀이판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연예인을 볼 차례다.
금객 가객 모였구나. 거문고 임종철이/노래의 양사길이, 계면의 공득이며
조선후기 도시민의 유흥적 욕구가 팽창하면서 음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바, 이 요구에 의해 노래와 거문고 연주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의 직업 음악인이 출현했는데, 이들을 각각 가객(歌客), 금객(琴客)이라고 불렀다. 거문고의 명인 임종철, 노래의 명인 양사길, 그리고 계면조의 명인 공득이는 아마도 이 시기의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 악기의 준비가 끝났으면, 이 놀이판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주인공, 곧 기생이 온갖 치장을 하고 차례로 들어온다.
각색 기생 들어온다. 예사로운 놀음에도/치장이 놀랍거든 하물며 승전놀음/별감의 놀음인데 범연히 치장하랴

별감은 기생을 지배하는 기부 중에서도 으뜸가는 존재다. 별감의 놀음, 승전놀음이기에 기생의 치장은 범연하지가 않다. 이제 머리 부분의 꾸밈부터 보자.
어름 같은 누런 전모, 자지갑사 끈을 달고/구름 같은 허튼머리 반달 같은 쌍얼레로/솰솰 빗겨 고이 빗겨 편월(片月) 좋게 땋아 얹고/모단 삼승 가리마를 앞을 덮어 숙여 쓰고/산호잠(珊瑚簪) 밀화(蜜花)비녀 은비녀 금봉차(金鳳釵)를/이리 꽂고 저리 꽂고/당가화 상가화를 눈을 가려 자주 꽂고
기생의 머리 위에 쓴 것이 전모(氈帽)다. 전모는 신윤복의 풍속화에 등장하는 기생 그림에 자주 나오는 것이다. 대나무로 우산처럼 살을 만들고 기름을 먹인 종이로 위를 바른다. ‘어름 같은 누런 전모’는 기름을 먹인 누런 유지가 얼음처럼 투명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전모를 자지갑사(紫地甲紗) 끈으로 턱 밑에서 맨다. 자지갑사는 자줏빛의 갑사인데, 갑사는 품질이 좋은 비단을 말한다. 전모 밑에는 당연히 머리가 있다. 구름같이 흩어진 머리를 얼레빗으로 빗는다. 얼레빗은 머릿결을 고르기 위한 발이 굵은 빗이다. 그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편월(片月) 좋게’란 말은 미상이지만, 어쨌든 머리를 잘 빗어 땋아 올린 모양의 묘사다.
백만교태 피우며 들어서는 기생들
‘모단(毛緞) 삼승(三升) 가리마’에서 ‘가리마’는 기생들이 쓰는 일종의 모자다.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내의원의 약방기생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가리마를 쓰고, 나머지 기생은 검은 베로 만든 가리마를 쓴다고 하였다. ‘모단 삼승’에서 ‘삼승’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모단’은 두툼한 비단을 말한다. 여기에 동원된 기생은 주로 약방기생들이다.
그리고 산호로 만든 잠과 밀화, 즉 호박으로 만든 비녀, 은비녀, 금봉차를 꽂았다. 금봉차는 금으로 만들되 봉황을 새긴 호사스런 비녀다. 그러고 나서 중국제 조화(唐假花)와 상가화(?)를 머리에 몸에 꽂는다(宋申用은 상가화를 ‘常假花’로 표기하고 있으나, 뜻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제 기생들의 옷차림을 볼 차례다.
도리불수 모초단을 웃저고리 지어 입고/양색단 속저고리 갖은 패물 꿰어 차고/남갑사 은조사며 화갑사 긴치마를/허리 졸라 동여 입고/백방수주 속속것과 수갑사 단속것과/장원주 너른바지 몽고삼승 것버선과/안동상전 수운혜를 맵시있게 신어두고/백만 교태 다 피이고 모양 좋게 들어온다
옷치레다. 웃저고리, 속저고리, 긴치마, 속속것, 단속것, 바지, 버선, 신발의 순으로 묘사하고 있다. 웃저고리는 도리불수 모초단으로 지었다. 도리불수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모초단(毛?緞)은 질이 좋고 무늬가 아름다운 비단이다. 이것으로 웃저고리를 지어 입었다. 속저고리를 지은 양색단은 앞에서 말한 대로 씨줄과 날줄의 색을 달리해 짠 비단이다. 이 양색단으로 지은 속저고리에 갖은 패물을 찬다.
긴치마는 남갑사(藍甲紗) 은조사(銀條紗) 화갑사(花甲紗)로 지은 것이다. 남갑사는 남색의 갑사일 터이고, 은조사(銀條紗)는 중국에서 수입한 여름 옷감용 비단이다. 화갑사는 꽃무늬가 있는 비단일 터이다. 긴치마 안에 속속곳과 단속곳을 입는다. 속속곳은 여자의 맨 속에 입는 속옷이다. 다리통이 넓고 밑이 막힌 것이다. 이것을 백방수주(白紡繡紬)로 지어 입는다 했는데, 아마도 ‘백방사주(白紡絲紬)가 아닌가 한다. 백방사주는 흰 고치에서 켠 실로 짠 비단이다. 단속것은 속속것 위에 덧입는 속곳이다. 수갑사(繡甲紗)로 지어 입는다 했으니, 수놓은 갑사로 지은 것인가 한다. ‘장원주 너른바지’의 너른바지는 단속것과 같되, 밑이 막힌 여자 바지라고 한다. 이것을 단속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필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보통 명주붙이로 만드는데, 장원주(壯元紬) 역시 명주붙이의 한 종류일 것이다.
승전놀음의 흥을 돋우는 음악
‘몽고삼승(蒙古三升) 것버선’이란 몽고삼승으로 만든 것버선인 바, 것버선은 솜버선 겉에 신는 버선을 말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이다. 수운혜(繡雲鞋)는 수를 놓은 운혜, 곧 여자의 가죽신인데, 앞의 코 부분과 뒤축에 구름 무늬가 있기 때문에 운혜라고 한다. 안동상전(安東商廛)은 ‘안국동의 상전(商廛)’으로 안국동에 자리잡고 있던 시전(市廛)으로 여겨진다. 기생을 지배하는 별감의 놀음이니 화려무비한 차림새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기생들이 입장한다.
내의원 침선비며 공조(工曹)라 혜민서며/늙은 기생 젊은 기생 명기(名妓) 동기(童妓) 들어온다
사처소의 기생들이다. 늙은 기생, 젊은 기생, 이름난 기생, 아직 머리를 올리지 않은 어린 기생이 들어온다. 이어 들어오는 기생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추월(秋月) 벽도(碧桃) 홍도(紅桃) 일점홍(一點紅) 관산월(關山月) 연앵(燕鶯) 부용(芙蓉) 영산홍(暎山紅) 채봉(彩鳳) 금옥(金玉) 초선(貂蟬) 만점홍(滿點紅) 매향(梅香) 죽엽(竹葉) 백릉파(白凌波) 모두 15명이다. 기생을 부르는 방식도 흥미롭다. “오동양월(梧桐良月) 밝은 달의 밝고 밝은 추월(秋月)이” 이런 식으로 호명하는 것이다.
자리를 호사스럽게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악기를 대령해놓고, 어여쁜 기생들까지 불렀으니 이제 승전놀음이 시작된다.
차례로 늘어 앉아 놀음을 재촉한다/화려한 거문고는 안족을 옮겨 놓고/문·무현 다스리니 농현소리 더욱 좋다/한만(汗漫)한 저 다스림 길고 길고 구슬프다/피리는 침을 뱉고 해금은 송진 긁고/장고는 굴레 죄어 더덕을 크게 치니/관현의 좋은 소리 심신이 황홀하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한다. 먼저 거문고 안족(雁足) 위에 줄을 옮겨서 얹는다. 그 다음 문현과 무현을 만져 농현을 한다. 농현은 일반적으로 거문고 해금 등 현악기에서 왼손으로 줄을 짚고 본래 음 외의 여러 장식음을 내는 연주방법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삼아 해보는 절차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어 한만한 ‘다스림’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스림’은 음악의 합주에서 악기간의 속도 호흡 음률을 맞추어보는 것, 또는 그것을 위해 만든 곡이다.
이어서 “피리는 침을 뱉고”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리 혀에 침칠을 하고 불어야 소리가 잘 나기 때문에 침을 뱉는 것이다. “송진 긁고”도 마찬가지다. 해금 줄에 송진을 칠해야 소리가 잘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장고에 굴레를 죄어 팽팽하게 한 뒤 장고를 더덕쿵 친다. 이것을 “더덕을 크게 친다”고 말한 것이다.
조율이 끝나면 노래가 시작된다.
거상조 나린 후에 소리하는 어린 기생/한 손으로 머리 받고 아미를 반쯤 숙여/우조라 계면이며 소용이 편락이며/춘면곡 처사가며 어부사 상사별곡/황계타령 매화타령 잡가(雜歌) 시조(時調) 듣기 좋다
오입쟁이들의 애창곡 ‘십이가사’
거상(擧床)은 연회 때 큰 상을 받기 전에 먼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고, 거상조(擧床調)란 바로 그 음악이다. 대개 가곡(歌曲), 가사(歌詞), 시조(時調)를 부른다. 우조(羽調), 계면(界面), 소용, 편락은 모두 가곡창의 곡목들이다. 가곡창은 시조를 노래 가사로 삼아 부르되, 3장 6구 중에서 6구는 부르지 않는다. 시조창이라면 다 부른다.
춘면곡(春眠曲) 처사가(處士歌) 어부사(漁父詞) 상사별곡(相思別曲) 황계(黃鷄)타령 매화타령은 십이가사의 곡목이다. 여기에 백구사 죽지사 행군악 권주가 양양가 수양산가가 추가되면 십이가사가 된다. 십이가사는 조선후기 기방에서 오입쟁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퍼토리였다.
그 다음 레퍼토리는 잡가와 시조다. 잡가는 십이가사와 곡목수가 동일한 십이잡가(十二雜歌)가 있는데,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집장가, 소춘향가, 선유가, 형장가, 평양가, 달거리, 십장가, 출인가, 방물가가 그것이다. 시조는 시조창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오입쟁이들은 십이잡가는 십이가사에 비해 격이 떨어진다 하여 부르지 않았고, 기생들은 가곡창에 비해 시조창의 격을 낮은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었다고 한다. 위의 잡가 시조가 꼭 십이잡가와 시조창을 가리키는지는 여전히 고찰의 대상이다. 노래가 있으면 춤이 있다.
춤추는 기생들은 머리에 수건 매고/웃영산 늦은 춤에 중영산 춤을 몰아/잔영산 입춤 추니 무산(巫山) 선녀 나려온다/배떠나기 북춤이며 대무 남무 다 춘 후에/안 올린 벙거지의 성성전(猩猩氈) 중두리에/주먹 같은 밀화(蜜花)증자 매암이 새겨 달고/갑사 군복 홍수 달아 남수화주 긴 전대를/허리를 잔뜩 매고 상모단 노는 칼을/두 손에 빗겨 쥐고 잔영산 모든 새면/항장의 춤일런가 가슴이 서늘하다
웃영산은 상영산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상영산(웃영산) 중영산 잔영산으로 짝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세 곡은 모두 영산회상곡의 변주곡이다. 원래 영산회상곡은 ‘영산회상불보살’이란 일곱 자를 노래하던 불교의 성악곡이었다. 이것이 뒤에 상영산, 중영산, 잔영산으로 변주되었던 바 대개 박자의 지속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즉 잔영산으로 갈수록 곡이 빨라지는 것이다. 영산회상곡은 다시 관악곡, 기악곡 등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위의 춤들은 아마도 기악곡이나 관악곡의 상영산, 중영산, 잔영산에 맞추어 추는 춤일 것이다.
이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그 종목은 웃영산 늦은 춤, 중영산 춤, 잔영산 입춤, 배떠나기 북춤, 대무, 남무, 검무의 순서다. 이 중 웃영산 늦은 춤, 중영산 춤, 잔영산 입춤은 도무지 알아볼 곳이 없다. 다만 입춤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설을 달 정도다. 입춤은 즉흥적인 춤, 곧 허튼춤의 한 유형으로 팔만 벌리거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 나름대로 멋을 부리며 추는 춤이라고 한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나마 아는 것이 다행이다.
배떠나기 북춤은 아마도 서도 민요인 배따라기곡을 부르면서 북을 치고 추는 춤으로 보인다. 대무는 남녀가 함께 추는 춤, 남무는 남자가 추는 춤이 아니라 기생이 쪽빛 창의를 입고 추는 춤이다.
이어서 약간 길게 묘사되는 것은 검무다. 검무의 복색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군복차림이다. 머리에 쓰는 것은 산수털벙거지다. ‘안 올린’이란 말은 벙거지 안에 천을 대었다는 말이고, 성성전(猩猩氈)은 성성이의 핏빛같이 진홍으로 염색한 빛으로 된 모전(毛氈)인데, 성성전 중두리는 성성전으로 만든 중두리란 말이다. 이 위에 밀화, 곧 호박으로 만든 증자(?子)를 붙인다. 증자는 군모 위에 붙이는 장식으로, 품계에 따라 금, 은, 옥, 돌 등 재료의 차별이 있다.
군복은 갑사, 곧 비단으로 지은 것이고, 거기에 붉은 소매(紅袖)를 단다. 그리고 전대를 차는데, 이것은 남색의 수를 놓은 화려한 비단으로 만든다. 즉 남수화주(藍繡花紬)다. 전대(戰帶)는 자루인데, 양쪽이 다 터진 것이다. 필요할 경우 여기에 물건을 넣고, 어깨에 맨다. 원래 장교는 비단으로, 졸병은 무명으로 짓는다. 이것을 남색으로 짓기 때문에 남전대라고 한다.
‘상모단 노는 칼’의 ‘상모단’은 미상이다. ‘노는 칼’은 칼날이 칼자루와 분리되어 움직이게 만든 칼이다. 요즈음 검무에서 칼날이 움직이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잔영산 모든 새면’은 잔영산 곡과 삼현육각의 삼현이니, 곧 삼현육각의 준말이다. 잔영산과 삼현육각에 맞추어 춤을 춘다는 뜻이 된다. 삼현육각은 피리 2, 대금 1, 해금 1, 장구 1, 북 1로 편성된다.
사치와 유행을 주도한 부류
이런 검무의 춤이 항장(項莊)의 춤처럼 보인다는 것인데, 항우가 홍문(鴻門)에서 유방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을 때 항우의 신하 항장이 유방을 죽이고자 칼춤을 추었던 것을 말한 것이다. 뒤에 따로 고종 연간에 궁중 정재로 항장무가 만들어지지만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승전놀음은 먼저 관현악이 한참 연주되고 난 뒤에 기생들이 들어와서 가곡, 십이가사, 십이잡가, 시조 등 성악곡을 부른 뒤, 여러 춤을 추고 마지막에 검무로 대미를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모두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만하면 별감들의 생리가 상상이 되는가? 별감은 복색의 사치와 유행을 주도하고, 시정의 유흥공간을 장악한 그런 부류였다. 이들이 역사 발전에 무슨 긍정적 기능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들의 존재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를 상상할 때면 인간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정치와 경제가 소외시킨 인간의 구체적 삶의 모습 말이다.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 ‘한양가’는 서울 시정의 온갖 부류들의 온갖 놀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오만가지 유흥과 다를 것이 없다. 별감의 사치스런 복색과 화류계의 지배는 오늘날 어떻게 변화했는가? 나는 별감의 행태에서 오렌지족이나 혹은 상류계층 자제분들의 행태를 연상한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고 무엇이 변화한 것인가? 나는 노는 것을 화두 삼아 우리나라 역사를 재구성해보고 싶다.

지난호에서 조선 후기 서울 유흥계의 주역이었던 별감(別監)에 대해 다루었다. 나는 별감이란 존재에 관심을 둔 이래, 별감의 속성을 잘 갖춘 실명(實名)의 별감이 존재하지 않을까 늘 궁금했다. 하지만 별감은 있어도, 별감 ‘아무개’는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치하고 노는 일에 골몰한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체적인 이름을 남긴 별감이 쉽게 나타날 리 만무인 것이다. 생각해 보라. 당신이 평생 한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기생의 기둥서방이 되어 술과 도박과 풍악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답할 사람이 있을지?
하지만 간절하게 바라면, 하늘이 보답하기도 한다. 나는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문집을 읽다가 내 기대에 꼭 들어맞는 인물을 발견했다. 김윤식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인물이다. 구한말 한문학의 대가요, 정치가인 것. 다만 그의 이름 앞에는 ‘친일파(親日派)’라는 관사가 붙는다. 한일합방 당시 일제가 주는 자작(子爵)의 작위와 은사금(恩賜金) 5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그의 문집 ‘운양집(雲養集)’에 ‘금사이원영전(琴師李元永傳)’이란 작품이 있는데 주인공 이원영(李元永)이 바로 별감이다.
유흥계 누빈 탕자
이원영과 함께 다룰 인물이 둘이 있다. 실존 인물도 아니고 별감도 아니지만, 유흥계를 누볐던 탕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다. ‘이춘풍전(李春風傳)’의 이춘풍과 ‘게우사’의 무숙이다. 이들은 오로지 소비와 유흥으로 일생을 보낸 인물이다. 이들을 통해 나는 탕자(蕩子)의 전형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남성에 한하여 탕자란 이름을 붙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탕자가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탕자는 언제부터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가? 이 점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한다. 나는 이 두 소설의 일부를 자료로 가끔 인용해왔는데, 사실 감질나는 일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김윤식의 ‘금사이원영전’부터 살펴보자.
김윤식은 30세인 1864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10여 년 동안 대과(大科)를 보지 않는다. 그는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이듬해(1874년)에야 대과에 합격하고 이후 출세 길을 달린다. 그가 이원영을 만난 때는 진사시 합격 2년 뒤인 1866년(병인년)이다. 그는 서울에 있을 때 금객(琴客)을 따라 노닐다 종종 그들이 금사 이원영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곤 했다. 왜 서울을 표나게 내세우느냐 하면, 그의 원래 집은 경기도 광주이기 때문이다. 1866년 봄 김윤식은 건원릉(健元陵) 참봉으로 있었다. 건원릉은 양주에 있는 조선 태조의 능이다. 능참봉이란 별 소임이 없어 무료해하던 중 어떤 사람이 이 고을에 거문고의 명인이 있으니, 불러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을 불렀더니, 풍채가 좋은 백발노인이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다. 김윤식은 “이곳에는 무엇이 있고, 이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식으로 점잖게 안내를 한 뒤 성과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그가 다름아닌 젊은 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거문고의 명인 이원영이 아닌가.
“나는 노인장께서 저 세상의 분이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이곳에 계시는군요?”
김윤식의 말에 노인은 자신의 평생을 늘어놓았다. 그에게 거문고를 주자, 거문고를 안고 석상처럼 꼼짝을 않더니,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 몸이 어인 몸고?
동궁마마 가까이 모시던 몸이라네.
이 거문고는 어떤 거문고인고?
세자께서 즐거워하시던 거문고라네.
꽃다운 젊은 세월 머물지 않아
이내 몸은 떠돌이가 되었다오.
거문고여, 거문고여!
누가 너를 알아줄까?
노래가 끝나자 한바탕 거문고를 타는데, 그 소리에 눈물을 떨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윤식이 제안을 하였다.
“노인께서는 이제 늙으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이름을 떨칠 수가 없으니, 내가 노인장을 위해 글을 써서 영원히 전해지게 해보지요.”
김윤식은 이원영의 평생사를 듣고 이것을 전(傳)으로 남긴다. 이것이 ‘금사이원영전’이다. 영원히 전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되, 어쨌든 지금 이 글을 보고 필자가 글을 쓰고 있으니, 김윤식의 의도가 과히 틀린 것은 아니리라. 이제 이원영의 이력을 쫓아가보자.
이원영의 초명은 원풍(元豊), 자는 군보(君甫)였다. 그의 가계는 10대조 이래로 모두 거문고를 배운 집안이었고, 이원영의 대에 와서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런 집안 내력을 가진 이원영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던가? 김윤식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
그는 타고난 성품이 호탕하고, 놀기를 좋아하여 집안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이 열일곱에 액정서 별감이 되어 좋은 옷을 입고, 여러 소년들과 어울려 기방에서 놀았다.
그 다음 일이야 뻔하지 않은가? 아리따운 기생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의 거문고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줄을 섰다. 기생들은 그를 흠모하였다. 다시 이원영의 행태를 보자.
기생들이 눈길을 주며 이원영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주기를 바라니, 이원영은 돈을 아끼지 않고 널리 그들의 환심을 사는 데 힘썼다. 이 때문에 여러 논다니 사내와 계집이 혀를 차면서 ‘이별감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호탕하고 기방에서 기생들과 어울려 놀며, 돈을 물 쓰듯 하는 것이야말로 과연 유흥의 주역인 별감의 전형이 아닌가?
이원영의 좋은 시절은 계속된다. 익종(翼宗)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시기에 그는 익종의 부름을 받는다. 익종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를 가리키는데 그는 순조 27년 2월부터 순조 30년 5월까지 부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익종은 이원영이 거문고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중희당(重熙堂)으로 불렀고, 그는 빼어난 연주로 우울한 세자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도 잠시였다. 원래 서울 시정을 쏘다니던 왈짜가 지엄한 궁중에서 지존지귀(至尊至貴)한 세자를 모셔두고 연주라니, 미칠 노릇이었을 것이다. 장승업이 그랬듯 그도 바깥세상의 음악이 그리워졌다. 그는 병이 들었노라 핑계를 대고 궁궐을 나와 다시 예전처럼 방탕한 삶으로 돌아갔다. 거문고 연주는 오묘한 경지로 진보하여, 당대의 일류 벼슬아치들이 다투어 그를 불러 연주를 들었다.
막 내린 호시절
권세가들은 오묘한 거문고의 음률을 선사한 이원영에게 내사 별제(內司別提), 경복궁 위장(景福宮衛將) 등의 벼슬을 주어 보답했다. 내사 별제는 내수사 별제(內需司 別提)를 말한다. 내수사는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수입이 많은 알짜배기 자리인 것이다. 그는 자급(資級·벼슬아치의 위계)도 올라, 마침내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이르렀다. 자헌대부라면 정2품의 품계다. 물론 정2품의 품계를 받는다 해서 그가 무슨 실권을 쥔 것도 아니고, 그 자급으로 실권이 있는 관직에 나아간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개 금사(琴師)로서 비록 이름뿐이기는 하지만 양반이 아닌 부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급까지 올랐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연주를 사랑했던 공경가(公卿家)들의 힘이었다.
이원영의 좋았던 시절도 저물기 시작한다. 중년이 되자 그는 창의문(彰義門) 밖의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일계산방(一溪山房)’이란 편액을 걸었다. 연주 현장에서 은퇴하고 거문고 교사가 된 것이다. 교사로서도 그는 빼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지도를 한번 거치면 누구나 탁월한 연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다투어 그를 찾았다. 그러나 살림살이는 궁핍하여, 얼마 안 가 집안이 기울게 되었다. 부자가 가산이 기울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당연히 도시를 떠나고 집을 줄인다. 그는 수원부(水原府)의 송산촌(松山村)이란 곳으로 집을 옮겨 오막살이를 짓고 자손을 가르치며 농사를 지어 자급하였다.
점차 나이가 들자, 눈이 침침해졌고 이내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다. 거의 장님이 된 그가 바깥출입이 용이할 리가 없다. 김윤식은 ‘성시(城市)’에 족적이 미치지 않은 것이 거의 1기(紀)라고 적고 있다. 12년이란 말이다. 그는 서울의 화류계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평소 그의 이름을 알던 사람도 그를 아득히 옛사람(古之人)인 양 아득히 여기게 되었다. 이원영은 늙어 쓸모없는 몸이 되었고, 게다가 흉년이 들어 살림이 더욱 궁박해졌다. 아내 또한 등이 굽은 꼬부랑할미가 되었다.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김윤식이 그리는 탕자의 회개를 보자.
이원영은 옛날 일을 떠올렸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름난 기생을 첩으로 들여앉히고 집안 일일랑 돌아보지 않으며, 재산을 기울여 기생의 욕심을 채워 주었다. 아내만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집안을 추슬러나갔다. 집안 재산이 마침내 거덜이 나자, 기생첩은 떠나갔고 아내만 남아 자신의 옷이며 밥을 챙겨 주었다. 이제 가난해지니 속으로 후회가 끌어올랐으며, 아내에게 몹시 부끄러웠다.
탕자는 낭비와 도박, 유흥으로 재산을 탕진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자관계다. 이원영은 최근까지 적용되었던, 아니 지금도 적용되는 탕자의 법칙에 따라 화류계의 반반한 여자를 첩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후 이 몰락의 공식은 비정할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한다. 여자는 돈을 보고 온 것이며, 돈을 빨아내기에 전력을 투구한다. 마침내 돈이 바닥 났고, 여자는 냉혹하게 떠났다. 아리따운 기생들 사이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남은 여성은 허리가 꼬부라진 늙은 아내뿐이다. 비로소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이원영의 아내는 어떤가? 평생 투계장, 도박장, 풍류마당을 쏘다니다가 이제 황량한 산골 구석에서 장부의 뜻을 굽히고 사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니, 이제야 자신의 남편이 되었다. 청춘에 남남처럼 지냈던 부부가 늘그막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지해 살 수 있게 된 것은 도리어 다행이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 이원영의 아내에게 아마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늙어서 알게 된 부부의 즐거움
이원영의 집안은 휑뎅그렁했다. 오로지 거문고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가을날 밤이 깊어 나뭇잎이 쓸쓸히 뜰에 떨어지면 늙은이는 일어나 거문고를 뜯고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아내 역시 평생 거문고 소리에 귀가 익었는지라 옆에서 연주를 비평했다. 그 즐거움도 보통이 아니었다. 이원영은 말한다. “늙어서야 비로소 부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소.”
‘이원영전’은 이렇게 끝난다. 물론 김윤식은 한마디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세상에 경박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비단옷을 베옷인 양 천히 여기는 자가 하루아침에 이원영 늙은이 처지가 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이 전을 보는 사람은 아마도 느낌이 있을 것이다.
김윤식은 점잖은 고문작가였다. 따라서 이원영을 묘사하는 방식도 점잖다. 그러나 이원영이 얼마나 호사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인지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원영만의 일이겠는가? 주색잡기에 몰두하면 패가망신하는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고 하고 ‘반드시’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관계가 필연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확률이 높으니, 이원영의 일이 이원영만의 일일 수는 없다.
이제 소설을 들어보자. 먼저 19세기에 널리 읽혔던 ‘이춘풍전’을 들어본다. 여기서 19세기란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소설이 19세기에 필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창작 시기는 그 이전으로 소급될 것이다. ‘이춘풍전’은 ‘춘향전’ ‘흥부전’ 등 몇몇 고전소설과 함께 현대에도 알려진 꽤나 유명한 작품이다. 명절이면 ‘마당놀이’라는, 전에 본 적이 없던 장르로 공연되기도 하는 작품이다. 방탕한(그리고 어리석은) 남편(남성)과 똑똑한 아내(여성)란 대립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시대에 더욱 환영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소설은 19세기의 사회문제를 다룬 것이다. 남녀의 대립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18, 19세기가 되면 조선사회는 경제적으로 전에 비해 여유가 생긴다. 자연히 소비가 늘고, 유흥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시정에 기방과 술집, 외식업이 생겨나는가 하면, 여성이나 남성의 복색이 화려해지는 것도 이 무렵부터다. 이 지점에서 소비하는 인간, 유흥하는 인간이 등장한다. ‘이춘풍전’의 이춘풍 역시 소비하는 인간, 유흥하는 인간의 전형이다.
이춘풍은 서울 다락골 출신이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아마도 서리층(書吏層)일 것이다. 다락골은 인왕산 아래 누각동(樓閣洞)을 말하는데, 이곳은 양반보다는 서리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또 이춘풍이 평양 장삿길에 서슴없이 나서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 양반은 아니다.
이춘풍의 아버지는 ‘장안의 거부(巨富)’였다. 외아들로 자라난 이춘풍은 부모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교동(驕童)’ 즉 교만한 성품의 아이가 된다. 소설적 설정이지만, 춘풍의 부모는 춘풍을 남기고 구몰(俱沒)한다. 삼년상을 마치자 달리 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외아들이라 말리는 형제도 없다. 그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춘풍이 망극하여 삼상(三喪)을 마친 후, 강근지친(强近之親)이 없어 춘풍을 경계할 이 없으매, 춘풍이 오입하여 하는 일마다 방탕하고, 세전지물 누만금(世傳之物 累萬金)을 남용하여 없이할 제, 남북촌(南北村) 오입쟁이와 한 가지로 휩쓸려 다니며 호강하며 주야로 노닐 적에, 모화관(慕華館) 활쏘기와 장악원(掌樂院) 풍류(風流)하기, 산영에 바둑두기 장기 골패 쌍륙(雙六) 수투전(數鬪?) 육자배기 사시랑이 동동이 엿방망이 하기와, 아이 보면 돈주기, 어른 보면 술대접하여, 고운 양자 맑은 소리, 맛 좋은 일년주(一年酒)며 벙거짓골 열구지탕 너비할미 갈비찜에 일일장취(日日長醉) 노닐 적에, 청루미색(靑樓美色) 달려들어 수천금을 시각에 없이하니, 천하 부자 석숭(石崇)인들 그 무엇이 남을손가. 티끌같이 없어지고 진토(塵土)같이 다 마른다. 전에 놀던 청루미색 나를 보면 헤어진다.
이춘풍이 하는 일이란 오로지 돈을 쓰는 일이다. 돈을 없애는 주된 종목은 첫째 도박이다. 바둑두기 이하 장기 골패 쌍륙 수투전은 18세기 이래 비상하게 유행했던 도박의 종목과 도박의 방법들이다. 그 다음이 기방 출입이다. ‘고운 양자, 맑은 소리’라고 했으니, 이건 기생이 노래를 부르는 기방이 틀림없다. 음식도 일년주 벙거짓골 열구지탕 너비할미(너비아니의 오기인 듯) 갈비찜 등 사치스럽다. 돈을 날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기생에게 홀리는 것이다. 청루의 미색이 달려들어 수천금을 시각에 없이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춘풍은 뒷날 평양에 가서 다시 한번 고비용(高費用)의 실습을 하게 된다.
돈 떨어진 탕자의 말로
이춘풍 수중에 돈이 떨어진다. 돈 없는 탕자가 돌아갈 곳은 어딘가?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라는 오래된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탕자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아버지·아들이 아내·어머니·딸에게 절대적인 우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던 조선시대가 아닌가? 아내는 돌아온 탕자-가장을 쫓아낼 수가 없다. 애써 충고한다. 단락에 번호를 붙여 살펴보자.
(1) 여보소. 내 말 듣소. 대장부 되어나서 문무간(文武間)에 힘을 써서 춘당대(春塘臺) 알성과(謁聖科)에 문무(文武) 참예(參預)하여, 계수화(桂樹花)를 숙여 꽂고 청라삼(靑羅杉) 떨쳐 입고 부모 전에 영화 뵈고, 후세에 이름 내어 장부의 사업을 하면, 패가를 할지라도 무엄치나 아니할고? 그렇지 못하면 치산(治山)을 그치 말고 농업을 힘써서 자식에게 전장(傳庄)하고 내외가 종신토록 환력평생하게 되면,
그도 아니 좋을손가.
(2) 부귀공명 마다하고 이녁이 어찌 굴어 부모의 세전지물(世傳之物) 일조일석(一朝一夕) 다 없애고, 수다(數多)한 노비 전답 뉘에게다 전장하고 처자를 돌아보지 않고, 주지탐색(酒池貪色) 수투전(數鬪?) 주야로 방탕하여 저렇듯이 되었으니 어이하여 사잔말고.
(3)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주색잡기(酒色雜技) 좋아 마오. 자고로 오입한 사람 뉘 아니 탕패(蕩敗)한가. 내 말 잠깐 들어보소. 미나릿골 이패두(李牌頭)는 청루(靑樓) 미색(美色) 즐기다가 나중에 신세 글러지고, 동문 밖의 오패두(吳牌頭)도 투전(鬪?) 잡기(雜技) 즐기다가 말년에 걸인 되고, 남산골 화진이도 소년의 부자로서, 주색 잡기 즐기다가 늙어서 그릇 죽고, 모시전골 김부자도 술 잘 먹고 허랑하기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기름장사 다니네. 일로 두고 볼지라도 주색잡기 다시 마오.

(1)의 가치는 둘이다. 첫째 과거에 합격하여 입신양명하는 것, 그로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둘째 그것이 아니면 농업에 힘써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부부 동락하는 것이다. 아마 이것이 조선시대인들이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춘풍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3)에서 열거된 주색잡기로 생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춘풍은 변명한다.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사환 대실이는 술 한 잔을 못 먹어도 돈 한 푼을 못 모으고, 이 각동이는 오십이 되도록 주색을 몰랐어도 남의 집 사환을 못 면하고, 탑골 북동이는 투전 골패 몰랐어도 수천금을 다 없애고 굶어 죽었으니, 일로 볼작시면 주색 잡기 하다가도 못사는 이 별로 없네. 자네 차차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술 잘 먹는 이태백(李太白)도 로자작(?횚酌) 앵무배(鸚鵡杯)로 백년 삼만 육천일 일일수경삼백배(一日須傾三百杯)에 매일 장취(長醉)하였대도 한림학사(翰林學士) 다 지내고, 자골전 일손이는 주색 잡기 하였어도 나중에 잘 되어서 일품(一品) 벼슬 하였으니, 일로 볼지라도 주색 잡기 좋아하기 남아의 상사로다. 나도 이리 노닐다가 일품 벼슬하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리라.
“딴소리하면 비부지자(婢夫之子)”
그럴듯하지 않은가?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잘사는 사회는 아닌 것이다. 적게 소비하고 많이 저축한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과정이 지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 건강을 잃는다면, 아내나 남편이 죽는다면, 전쟁이 난다면 등등 재산 축적을 방해하는 요인은 수십 가지도 넘는다. 어쨌거나 탕자의 변명에도 일말의 설득력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자.
이춘풍은 이런 말로 아내의 입을 막고 다시 가산의 탕진에 매진한다. 결과는 자명하다. 그는 ‘조석(朝夕)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가산을 탕진’한다. 그제야 완전히 집으로 돌아온다.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지성으로 빌며, 가장의 권한을 포기한다. 아내가 근고하여 돈을 모아도 옛버릇이 나서 낭비할 줄 어떻게 아느냐고 하자, 이춘풍은 맹세하는 문서를 써준다. 아내가 당신의 성격상 문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침을 놓자, 춘풍은 “이후로 달리 딴소리를 하면 비부지자(婢夫之子)”라는 치욕적인 내용의 문서를 다시 써준다. 아내는 문서를 챙겨쥐고 과연 근검 절약으로 유족한 살림을 이룬다.
탕자가 늘 그러하듯, 이춘풍은 곤경을 벗어나자 딴 생각이 들었다. 호조 돈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려 한다. 아내가 평양을 색향(色鄕)이라 “돈 많고 허랑한 사람 세워두고 벗긴다”면서 옛날 이춘풍이 써준 문서를 들이대고 만류하자, 이춘풍은 그 동안 억눌러두었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운다. “천리 원정(遠征) 장삿길에 요망한 계집년이 잔말을 하니, 이런 변 또 있는가?”
소설의 작자는 이 말고 함께 이춘풍이 아내를 다루는 손속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질고 착한 아내 머리채를 선전시전 비단 감듯, 상전시전 연줄 감듯, 사월 초파일 등대 감듯, 뱃사공의 닻줄 감듯, 휘휘칭칭 감아 쥐고 이리 치고 저리 친다.” 아아, 끔찍한 가정폭력이여, 그 뿌리가 깊기도 하구나.
그 다음은 다 아는 얘기다. 춘풍은 평양 기생 추월(秋月)에게 홀려 장사밑천을 다 날린다. 추월이 춘풍의 밑천을 들어먹는 솜씨가 다양하기 짝이 없다.
통한단 쌍문초(雙紋?) 도리(桃李) 불수(佛手) 능라단(綾羅緞), 초록 저고리감 날 사 주오. 은죽절 금봉채 갖은 노리개 날 해 주오. 두리소반, 주전자, 화로, 양푼, 대야 날 사 주오. 동래반상(東萊飯床), 안성유기(安城鍮器), 구첩반상, 실굽다리 날 사 주오. 요강, 타구, 새옹, 남비, 청동화로 날 사 주오. 백통대, 은대, 금대, 수북 담뱃대 날 사 주오. 문어, 전복, 편포 안주하게 날 사 주오. 연안(延安) 배천(白川) 상상미(上上米)로 밥쌀하게 팔아 주오. 동래 울산 장곽(長藿) 해의(海衣) 날 사 주오.
기방을 이용한 손님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다만 기생이 자신과 살림을 차린 손님을 털어먹는 방식은 위와 같은 것이다. 아니, 지금도 그렇지 아니한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딴살림을 차린 돈 많고 늙은 남성이 과연 어떻게 그 여성을 붙잡아둘 것인가? 옷과 살림과 집을 사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쪽 방면은 바뀐 것이 별로 없는 것같다. 돈을 다 털린 이춘풍은 급기야 추월이 집의 사환이 된다.
‘이춘풍전’의 후반부는 여성들에게 통쾌한 이야기다. 춘풍의 아내는 기지로 평양감사의 비장(裨將)이 되어 평양으로 가서 추월을 징치하고 돈을 되찾는다. 이춘풍은 덤으로 찾아온다. 물론 정말로 회개한 이춘풍이다.
잠시 평양 기생 이야기를 해보자. 문헌을 보건대, 평양 기생은 서울 기생과 생리가 사뭇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역시 연구된 바 없다. 다만 평양 기생에게 상인들이 장사밑천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더러 전해져온다. 이능화(李能和)의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를 보면, 평양 기생에게 홀린 상인 이야기가 몇 있는데, 첫 번째 것을 들면 이러하다. 남쪽 지방의 한 상인이 배에 생강을 싣고 평양으로 떠났다가 평양 기생에게 홀려 생강을 몽땅 날리고 기생에게 쫓겨났다. 깨고 나니 이런 허망한 일이 없다. 그 심정을 시로 읊었다.
멀리서 보니 말(馬) 눈깔 같고,
가까이서 보니 고름주머니 같네.
두 볼에는 이(齒)가 하나도 없는데,
배 한 척에 실은 생강을 죄다 먹어 치웠네.
遠看似馬目, 近視如濃瘡
兩頰無一齒, 能食一船薑
눈치 빠른 독자들은 무엇을 두고 하는 소리인지 짐작이 가실 것이다. 평양 기생이 상인의 주머니를 터는 솜씨가 기가 막히지 아니한가.
‘이춘풍전’보다 더한 소비와 유흥으로 일생을 보낸 탕자는 소설 ‘게우사’에서 볼 수 있다. ‘게우사’의 주인공은 무숙이다. ‘게우사’는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대개 18세기이면 소설의 얼개가 완성되어 있었고,
현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작품은 19세기 후반에 필사된 것이다.
먼저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두자. ‘이춘풍전’이야 다 아는 소설이지만, 이 작품은 아직은 아무래도 낯설기 때문이다. 서울 장안의 갑부 무숙이는 사치와 유흥으로 사십 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이런저런 놀음으로 평생을 보낸 터라, 이제 흥이 나지 않는다. 일품요리도 매일 먹으면 빈자(貧者)의 소찬(素饌)과 다름이 없다. 사치와 유흥도 일상이되면 전혀 즐겁지 않다.
무숙이는 최후로 한판의 놀음을 벌인 뒤 자신의 유흥과 오입을 끝내고 착실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 엉뚱한 선언에 말리는 왈짜, 찬동하는 왈짜간에 논란이 일고 과연 어디서 최후의 한판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 군평이란 왈짜가 평양 기생 의양이가 화개동(花開洞)에 기방을 열었는데, 천하절색이라고 하여 거기로 가기로 한다. 무숙이는 의양을 보자, 그 자리에서 반해 의양을 첩으로 들여앉히기로 결심한다. 의양이 거절하자, 무숙이는 집에 돌아와 절절한 연서(戀書)를 보내어 의양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침내 그녀와 딴살림을 차린다.
평생을 유흥판과 오입으로 보낸 무숙이가 의양과 살림을 차리기로 한 뒤 벌인 일은 무엇인가? 우선 내의원(內醫院) 소속 기생인 의양을 면천(免賤)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인다. 그리고 의양과의 살림집을 호사스럽게 마련하고 오로지 돈 쓰는 일로 나날을 보낸다.
십만냥 들인 유산놀음
의양은 이런 생활을 보내다가 무숙이 몰락하면 원망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 고민한다. 그래서 자기도 평양과 한양성에서 돈 잘 쓰는 인간을 보았지만, 당신처럼 굉장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비꼬면서 추켜세우자,
무숙이는 곧이듣고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쓰는 사람인지 자랑한다.
무숙이는 장악원의 악공(樂工)과 온갖 음악인을 다 불러 서울 근교의 경승지를 돌아다니며 십만 냥 이상을 들인 거창한 유산(遊山)놀음을 벌인다. 이어 의양이에게 자랑하기 위해 배를 새로 만들어 선유(船遊)놀음을 벌인다. 이 역시 판소리 광대를 비롯한 온갖 연예인을 다 불러모으고 유산놀음 이상 가는 비용을 들인다.
의양은 무숙의 아내와 몰래 모의한 뒤 그를 길들이기로 작정한다. 의양은 종 막덕이와 무숙의 친구 별감 김철갑 등의 협조로 무숙의 재산을 남김없이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종 막덕이를 시켜 온갖 곳에서 무숙이의 빚을 요구하더라 하고, 그것을 빌미로 재산을 빼돌려 감춘다. 무숙은 결국 알거지가 되어 본가로 돌아가 품팔이 노동을 한다. 무숙의 품팔이 노동자 노릇은 결국 돌고 돌아 의양의 집에서 중노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낙착된다. 여기서 무숙은 의양의 계획에 따라 온갖 수모를 겪는다. 최후에 의양이는 무숙의 친구 별감 김철갑과 짜고 무숙이 보는 데서 농탕질을 치는데, 무숙은 이 둘을 죽이고자 하여 비상을 푼 물을 끓인다. 무숙이 비상물을 달이는 것을 보고, 의양은 모든 일이 무숙을 개과천선시키고자 한 의도적인 각본이었음을 털어놓는다. 이하는 낙장이라 알 길이 없지만, 무숙은 아마도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가, ‘게우사’와 ‘이춘풍전’은 슬기로운 아내가 낭비적 남편을 길들인다는 동일한 주제에 유사한 플롯을 갖고 있다. 아내가 남편을 회개시킨다는 설정은 사실 비현실적인 것이다. 하지만 두 소설은 조선 후기 사회의 진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두 이야기는 철저히 소비적 유흥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회개에는 관심이 없다. 아내가 남편을 회개시켰다는 소설의 설정에도 물론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이 있다면, 이춘풍과 무숙이 같은 소비적이고 유흥적 인간이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무숙이의 사치스런 모습을 보자. 무숙이가 기방에서 자신이 이제 화류계 출입을 그만두겠노라고 맹세하러 가는 길이다. 옷차림을 보자.
석양산로(夕陽山路) 제비같이 어식비식 들어올 제 호사(好事)치레 볼 양이면, 엽자(葉子) 동곳 대양중(大洋中)의 산호(珊瑚) 동곳 어깨 꽂고 외올망건 대모관자(玳瑁貫子) 쥐꼬리 당줄 진품 금패 좋은 풍잠(風簪) 이마 위에 숙여 띠고 갑주(甲紬) 보라 잔줄 저고리 백갑주 누비바지 백제우사 통한삼의 장원주 누비동옷 통화단 잔줄배자 양색단(兩色緞) 누비토수 순밀화장도(純蜜花粧刀) 학슬안경(鶴膝眼鏡) 당세포(唐細布) 중치막에 지품당띠 통대자 허리띠며 우단낭자 오색모초 고운 쌈지 당팔사(唐八絲) 끈을 달고 용두향에 대당전을 안 옷고름에 달아 차고 버들잎 본 고운 발 육날 미투리 수지 버혀 곱걸어 들먹이고…
지난호에서 별감을 다루면서 별감의 호사스런 복색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별감 특유의 옷만 빼면 의복과 장신구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달리 설명을 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호사의 극을 달리는 옷치레다.
계획 없는 돈 씀씀이
무숙이는 소비하는 인간이자 사치하는 인간이다. 다만 소비와 사치가 인간을 필연적으로 몰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몰락은 소비와 사치를 조절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무숙이가 바로 그런 인간이다. 그는 돈을 쓰는 데 전혀 계획성과 절제가 없다. 의양이와 살림을 차리기로 했을 때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의양이를 기적(妓籍)에서 빼내는 것이었다. 의양이는 관기(官妓)고 약방(藥房)에 소속된 약방기생이니, 약방에 줄을 대고 돈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돈을 쓰는 데 전혀 계획성이 없다. 그는 “구실을 떼어도 긴한 곳을 생각하여 한 군데만 청을 해도 될 일”을 “헙헙하고 일 모르고 제 형세만 생각”하여 상의원(尙衣院) 침선비(針線婢)에게 300냥, 공조(工曹)의 행수 부행수(行首 副行首·행수기생, 부행수기생)에게 400냥, 약방(內醫院) 장무서원(掌務書員)에게 500냥, 그리고 부제조(副提調) 대감(내의원 부제조)에게 1000여 냥, 이럭저럭 4000~5000냥을 들인다. 이렇듯 무숙이의 돈 쓰기는 요령부득이다.
무숙의 미친 마음 내두사 경영 없이 뒤끝을 생각잖고 돈쓰기만 위주하고 남만 좋게 하자 하니, 손톱 밑에 배접만 알고 뱃속 내종(內腫)은 몰랐으니, 무숙의 잡놈 지식을 금할 사람 뉘 있으랴? 매일 일용 쓰는 것이 삼사백을 넘어 쓰고 갖은 율속 풍유랑과 명기 명창 선소리며 소창 범백 각기 처하 하루 잠깐 놀고 나도 근천금씩 탕탕 쓰고, 일가 족속 노속 간에는 푼전일이 땀이 나고 담배씨로 간거리를 파니, 사론 공고 버서진 놈 무뢰잡탕 허랑객중에 무숙이가 어른이라. 돈을 써도 수가 있고 아니 써도 수가 있는데, 열 냥 쓸 데 천 냥 쓰고, 천 냥 쓸 데 한 냥 쓰니, 적실인심 무숙이고 불의 심사 무숙이라.
기생첩에게 선물한 맨션아파트
도무지 그는 돈을 쓰는 데 무슨 규모라고는 없다. 오로지 노는 일에 골몰하고 노는 일에만 돈을 물 쓰듯 쓴다.
의양이를 기적에서 빼내자 곧 의양이와 살 집을 마련한다. 의양이가 머물고 있던 화개동 경주인(京主人) 집을 5000냥에 사들인다. 집치레를 훑어보자.
내사 지위 토역장이 청우정(聽雨亭?) 사랑 앞에 와룡(臥龍)으로 담을 치고 석수장이 불러 숙석(熟石)으로 면을 치고, 전후좌우 좋은 화계 모란 작약 연산홍과 들충 측백 전나무며, 금사화 죽연 포도화 측죽황 연브려(?) 있다. 옥분에 심은 매화, 녹죽 창송 천고절을 여기저기 심어놓고 사계 철죽 향일화며 난초 파초 좋은 종을 대분에다 심어 놓고, 향원 춘색 어린 곳에 화중군자 연화꽃 너울너울 넘노난 듯 홍도 벽도 일지매화 일단선풍 기이하고 치자 동백 석류분에 유자 화분 더욱 좋다. 사신 행차 부탁하여 오색 붕어 유리항에 백연조, 앵무조며 학두루미 나래 벌여 뚜루룩 길룩 길들이고, 완자담 일광문은 갖은 추병(?) 틀어 있고, 청삽사리 문 지키고 백수흑면 좋은 개는 천석 누리 노적 밑에 잠을 재워 길들이고 억대 황수 소 두 마리 양지 바로 마구 지어 그득하게 세워두고…
이게 마당치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애완동물―오색붕어, 백연조, 앵무새, 학두루미를 키우고, 거기에 당연히 집을 지킬 개와 농사를 지을 소를 기른다. 기생첩에게 주는 맨션아파트인 셈인데,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무숙의 사치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본다. 이것이 아마 백성들이 갖고 싶어한 이상적 주거였을 것이다. 이제 집안 내부를 돌아보자.
방안치레 차릴 적에 각장장판(角壯壯版) 당지도(唐紙塗)며 매화류 방장 개천도(開天圖)를 항상 보기 좋게 걸어두고 대모병풍(玳瑁屛風) 삼국 그림 구운몽도(九雲夢圖) 유향도며 관동팔경(關東八景) 좋은 그림 각병에다 그리고 화류평생 금패서안 삼층들이 각게수리 오시목 갖은 문갑 자개함롱 반다지 대모책상 산호필통 사서삼경(四書三經) 온갖 책을 적성권축(積成卷軸) 쌓아 두고, 돈피방장(?皮房帳) 호피방장(虎皮房帳) 왜포 청사 모기장을 은근히 드리우고 평생 먹을 유밀과며 평생 쓸 당춘약(唐春藥)과 진옥 새긴 별춘화도(別春畵圖) 청강석(靑剛石) 백강석(白剛石)과 산호 호박 청백옥 모두 들여 온갖 가화(假花) 칠보 새겨 유리 화류장을 꾸며 내어 보기 좋게 놓아 주고 천은(天銀) 요강 순금 타기(唾器) 백동(白銅) 재떨이 백문 설합 새별 같은 대강선의 철침 퇴침 대안석의 대체경(大體鏡) 소체경(小體鏡)에 오도독 주석(朱錫) 놋촛대에 양초 박아 놓아두고 유리 양각등을 달고 홍전(紅氈) 백전(白氈) 몽고전(蒙古氈)과 진지 보초 모탄 … 각색 금침 수십 벌과 십성진품(十成珍品) 갖은 패물 좋은 모물(毛物) 걸어놓고 …
집안을 각종 그림과 책과 문방구, 이부자리 등 소소한 생활 제구로 가득 채우고 있다. 물론 최고급이다. 오죽했으면 침이나 가래를 뱉는 타구조차 순금으로 만들고(純金 唾器), 요강조차 은으로 만들었을까(天銀 요강). 그뿐이랴. 오입쟁이 잡놈답게 중국에서 수입한 최음제(평생 쓸 당춘약)와 포르노그라피―춘화(春畵·진옥 새긴 별춘화도)까지 구비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산삼 녹용 부경 잡탕 경옥고(瓊玉膏) 팔미환(八味丸) 사물탕(四物湯) 쌍화탕(雙和湯)을 장복하고, 은금보화 비단 포목 구산(丘山) 같이 쌓아놓고 사절 의복 삼시벌에 멀미증이 절로 나고, 고량진미 어육 포식 보기 심상 쌓였으니, 씀바귀 나물 시래기 된장덩이 산채나물이 새맛이라 의식이 그립잖고 근심 걱정 없어지니 석숭 의돈 부러할가.
보약과 정력제가 가득하다. 거기에 고량진미까지 푸짐하다.
이것은 판소리의 과장적 수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당대인이 ‘호사’로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고, 이것은 아마도 당시 부호들의 실제 생활과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무숙이는 돈 쓰는 것이 일생의 소업이다. 사치와 소비로 일관하는 그의 생활을 보고 의양이는 기가 막힌다. 만약 무숙이가 탕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기생첩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시침을 떼고 화색을 지어 슬쩍 무숙의 속을 떠본다.
“나도 평양 같은 번화장과 장안성 남북촌의 호걸남자 오입쟁이 돈 쓰고 노는 일을 드문드문 들어도 서방님 돈 쓰고 노는 위풍 찰찰한 멋 아는 법은 아국무쌍(我國無雙)이오, 재사일등고작간이(?) 간간한 서방님 정에 지쳐 내 죽것네.”
어리석은 무숙은 비꼬는 줄도 모르고, “자네가 내 수단 돈 쓰고 노는 양을 구경하면 장관 되리”라고 말한다.
이에 의양이 “호기 있게 노는 것과 돈 쓰는 구경을 한번 하면 좋겠소”라고 하자, 무숙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만냥이나 드는 거창한 유산놀음을 벌인다. 놀음이 끝나자 의양은 기가 막힌다.
“이번 놀음에 십만냥을 넘게 썼으니, 호기 있는 서방님을 선천지 후천지의 본받을 이 뉘 있을까?”
“그까짓 돈 쓴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할까?”
“그 웃수로 노름하고 돈을 쓰면 어떻게 쓰오?”
“선유놀음 하거든 귀경을 하소.”
선유놀음에 계산도 못할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다. 의양은 무숙이의 낭비에 충격을 받고 ‘정신이 아득하여 면경 체경 화류문갑을 각장장판에 내던지면서’ 험한 소리를 퍼붓는다. 끝부분을 인용한다.
요 자식아, 잡 자식아, 쓸개없는 김무숙아, 알심 많고 멋 아는 일 너와 삼생 원수로다. 안고수비(眼高手卑) 네 큰 수단 네 집 처자 피가 나니,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를 널로 두고 이른 말이.
하지만 이 정도의 험한 소리에 회개할 무숙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의양이의 입에서 나온 무숙이가 낭비한 돈의 출처다. 이 돈은 원래 열두입변 대돈변 체계돈 마게돈 등 이름도 요상한 대금업자에게서 차용한 돈이다.
무숙의 아내는 “허다한 선물, 공물, 시골 농막, 가대, 세간”을 수없이 방매하여 이 빚을 막아낸다. 무숙은 오로지 빌린 돈으로 거창한 유흥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무숙의 아내가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탕자는 아내의 고생이든 기생첩의 막말이건 도무지 돌아보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다.
중노미로 전락한 탕자
의양이는 막덕이와 계략을 꾸며 가장 집물을 빼돌리고 1000냥을 마련해 내 놓자 무숙이는 이 돈을 노름(골패)으로 또다시 탕진한다. 돈이 떨어지자 무숙은 다시 외삼촌에게 사기를 친다. 부모의 묘자리를 옮기려 하여 명당을 찾았던 바, 만냥의 이전 비용 중 5000냥이 부족하다면서 곧 갚겠노라며 빌린다. 이 돈 역시 투전 쌍륙 등 온갖 노름으로 날리고 만다. 다음은 예정된 코스다. 그는 자신의 장신구를 팔고, 나들이옷을 팔고, 급기야 속옷과 상투까지 잘라서 판다. 최후에 도달한 것이다. 갱생을 위해 그는 품팔이꾼으로 나서고, 급기야 의양이 집의 중노미로 전락한다.
탕자의 말로란 대개 비참하다. 위에서 든 세 편의 이야기에서 사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김윤식의 ‘금사이원영전’일 것이다. ‘이춘풍전’과 ‘게우사’의 아내가 탕자 남편을 구하는 것은 리얼리티를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나는 우리가 최근까지 보아온 탕자의 전형적 몰락 과정이 대개 18세기경생겨났으리라고 본다.
인간은 노동만으로 살 수 없다. 쉼 없는 노동은 인간을 파멸시킨다. 노동과 함께 필요한 것이 휴식이다. 휴식은 노동으로부터의 단순한 해방이다. 그러나 노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적극적 해방이다. 인간은 쉬기 위해 또 다른 일을 벌인다. 이것이 유희다. 유희는 여러 말로 변형된다. 유흥으로, 오락으로, 놀이 등으로 말이다. 어쨌든 인간의 모든 삶은 노동과 유흥으로 양분된다. 노동 없이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듯, 유흥 없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유흥은 노동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는 어디인가?
노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노는 것’과 ‘소비’의 한계는 어디인가? 자본주의가 온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판국에 유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유흥과 소비가 아니면 현대의 자본주의는 존속할 수가 없다. 예컨대 컴퓨터 게임 때문에 학생들이 타락한다고 한탄하지만, 동시에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는가? 주조업(酒造業)은 대폿집과 단란주점과 룸살롱의 증가를 원하며, 보다 많은 인간이 알코올에 중독될 것을 권한다. 이원영과 이춘풍과 무숙이의 일생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일단 해방된 현대의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무숙이의 변명을 들어보자.
세상에 내가 나서 여한 없이 좋은 행락(行樂) 종이목지소호(從耳目之所好)하니 이제 죽어 한이 없다. 가소롭다, 이 세상을 허송세월 하올소냐. 화개필유중개일(花開必有重開日), 꽃은 다시 피려니와, 인로증무갱소년(人老曾無更少年)을, 우리 인생 늙어 죽어 북망산천 돌아갈 제 일편 단정(丹旌) 앞세우고 행색이 처량할 제 처자식이 따라오며 부귀영화 묻어올까? 천부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옛사람 이른 말을 자네 일정 모르는가. 설마 굶어 죽을손가?
‘이춘풍전’의 이춘풍의 말과 다를 바 없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무숙이는 되묻는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오로지 감각적 쾌락만을 쫓는 이 시대에 무숙의 발언은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어디로 갔는가.

인간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과연 그런가? 내가 아무리 북한산 아래 경치 수려한 곳에 살고 싶다 한들 나는 거기에 살지 못한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오로지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 가능한 자유일 뿐이다. 돈과 권력이 없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더욱 나쁜 거주지로 갈 자유이지 좋은 거주지로 갈 자유는 아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의 거주지에는 구획이 생긴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은 돈과 권력의 보유 정도에 따른 인간의 어울림을 뜻한다.
요즘 세상이 이러할진대,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의 서울은, 양반 거주지와 중인 거주지, 상인 거주지가 대충 구분돼 있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서울 시내에 오로지 특정 부류 인간으로 주거가 제한된 그런 공간도 있었다. 물론 그 잘난 양반들은 아니다. 이런 특수한 공간의 존재는 거주민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조선시대 서울 안에 존재한 특수한 주민의 특별한 거주공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소의 도살이 가뭄을 초래한다?
엉뚱하지만 쇠고기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옛말에 육식자(肉食者)란 말이 있다. 채식주의자의 반대말이 아니라 귀족이나 고급관료를 뜻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지배계급을 의미했듯, 중세사회에서 고기는 극히 귀한 음식이었다. 농업사회인 조선사회에서 고기는 당연히 귀한 음식이었고, 특히 쇠고기는 정책적으로 식용을 제한한 식품이었다.
‘태종실록’을 말머리로 삼아보자. 태종 15년 6월5일 임금은 육선(肉膳), 곧 고기반찬을 물리치고 술을 끊었다. 동양사회에서 가뭄이나 홍수, 기타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은 근신하는 의미에서 고기가 없는 밥(素饌)을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태종 역시 그런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육조와 승정원에서 아뢴 가뭄을 초래한 여러 원인 중에 ‘소의 도살’이 끼여 있다는 것이다.
“소를 도살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이 있는데, 근래에 도살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도살자를 붙잡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범인의 가산(家産)을 상(賞)으로 주고, 대소 인원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죄를 논하소서. 그리고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서울은 한성부에서 세금을 매기고, 지방은 관청의 명문(明文)을 받은 뒤에 매매를 허락하되, 어기는 자는 또한 법에 의해 죄를 논하소서.”
금령에도 불구하고 소의 밀도살이 가뭄을 초래했으므로, 밀도살을 엄금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의 도살이 왜 가뭄을 불러왔다는 것인가. ‘숙종실록’ 9년 1월28일조를 보면 송시열(宋時烈)이 가뭄을 걱정하면서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자의 말은 이렇다. “농사가 흉년이 드는 것은 소를 잡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면서도 소를 도살해 먹기 때문에 소의 원한이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이것이 자연의 운행 질서를 깨뜨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생 소의 육신을 부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고기마저 먹는 것은 정말 잔인하지 않은가? 이것이 정자의 생각이었다. 물론 이 이야기 이면에는 농사를 위해 요즘의 트랙터격인 농우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업사회의 실용적 동기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생명에 대한 자연스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정말 수입 쇠고기라도 고기를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덧붙이자면, 율곡 이이는 이런 이유로 평생 쇠고기를 먹지 않았고, 율곡 집안에서도 율곡의 제사에는 쇠고기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거나 소의 도살이 가뭄을 초래한다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위 인용문에 나와 있듯, 조선 정부에서는 법령을 정해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도살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 조선 초기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먹는 것은 백성의 근본이 되고, 곡식은 소의 힘으로 나오므로, 본조(本朝)에서는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하였고, 중국에서는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으니, 이는 농사를 중히 여기고 민생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다.”(‘세종실록’ 7년 2월4일).
즉 금살도감이란 관청을 설치하면서까지 소의 도살을 막았고 실천도 강력했다. 1411년(태종 11년)에 소의 도살을 전문으로 하는 신백정(新白丁)을 도성 90리 밖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고기를 밝히는 인간의 욕망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세종 7년에는 신백정이 도성으로 되돌아와 도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성부에서는 이들을 바닷가로 축출하고, 밀도살된 쇠고기를 사먹는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로 다스릴 것을 논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세종실록’ 7년 2월4일).
이런 법과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의 도살과 쇠고기의 식용이 멈춘 적은 없었다.
성종 4년 7월30일 부제학 이극기의 상소문의 일부를 보자.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령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서울 성내의 대소인(大小人)의 집에서 아침저녁의 봉양(奉養)이나 빈객(賓客)을 연향(宴享)할 때에 대개 금지한 쇠고기를 쓰고, 관가(官家)에서 공급하는 것도 또한 간혹 쓰니, 이러한 고기들이 어찌 모두 저절로 죽은 것들이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날이 반복되어 그치는 때가 있지 아니하니 정히 사방의 농민들의 가축이 점차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쇠고기 식용 금지는 결코 지켜질 수 없는 법이었던 것이다. 이후 쇠고기의 식용을 두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처벌도 강화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잡은 사람은 전가사변(全家徙邊)이란 극형에까지 처했으나(‘연산’ 11년 4월20일),
고기를 밝히는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쇠고기에 관련된 적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으나, 그것을 여기서 낱낱이 주워섬길 수는 없다. 다만 법은 존재하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은 때로 강화되었다가 이내 느슨해지는 식의 반복을 거듭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쇠고기를 소비하는 주 계층이 다름아닌 조선의 지배계급인 사대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뜬금없이 쇠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쇠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도살하는 사람과 유통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소의 도살이라 하면 곧 백정을 떠올리고, 또 백정 하면 홍명희가 창조한 양주(楊州) 백정 임꺽정을 떠올릴 것이다. 뭔가 좀더 아는 사람이라면, 백정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형평사(衡平社) 운동을 떠올릴 것이다.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작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사회학적 문제가 아니라 쇠고기의 생산과 유통, 곧 누가 언제 어떤 필요에 의해 소를 도살하고, 어떤 유통망을 통해 어떤 가격으로 판매하였는가, 또 어떻게 쇠고기를 소비(요리)했는가 하는 문제다. 일종의 생활사적 문제인 것이다.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서울 쪽이다. 서울은 조선 제일의 도시고,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니 쇠고기의 최대 소비처였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의 소는 누가 도살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었을까? 이것이 이 글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백정이 그것을 담당했던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백정은 조선 전기에 서울 시내에서 축출되었다. 그렇다면 백정이 아닌 어떤 계층이 소의 도살과 쇠고기의 유통에 관여했던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자. 조선 전기는 자세한 사정이 나와 있지 않으니,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진왜란 뒤의 일이다.

서울은 조선시대 최대의 인구밀집 도시이고, 또 생활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니, 당연히 음식과 요리의 수준도 다른 곳과 비할 바가 못된다. 서울은 생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모든 식료품이 서울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서 공급되었다.
이 식료품을 유통시키는 곳이 곧 시전(市廛)이었다. 시전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국가에서 국가와 왕실, 서울 시민들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설치한 공식 시장이었다.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분석해보면, 당대 서울 시민, 나아가 조선사람의 일상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나의 관심사인 식료품을 다루되, 고기류에 한정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본예(柳本藝)는 서울의 인문지리지 ‘한경지략(漢京識略)’의 ‘시전(市廛)’에 시전의 종류와 판매 물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바, 여기에 서울 시내에 판매되는 고기의 종류가 나온다. 쇠고기를 뺀 나머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생치전(生雉廛) 건치전(乾雉廛) 생선전-병문(屛門)에 있다.
닭전(鷄廛)-광통교에 있다. 계란전도 그 곁에 있다.
저육전(猪肉廛)-여러 곳에 있다.
생치는 산 꿩, 건치는 말린 꿩이다. 꿩은 아마 사냥으로 잡은 것일 터이다. 꿩고기, 닭고기와 돼지고기(猪肉)가 서울 시민들에게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쇠고기를 제외한 서울 시전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종류다. 꿩을 제외하면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저육전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돼지고기가 꿩과 닭에 비해 많이 소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쇠고기 쪽을 보자. 박제가는 ‘북학의(北學議)’에서 서울의 쇠고기 소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날마다 소 500마리를 도살하고 있다. 국가의 제사나 호궤(?饋,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함)에 쓰기 위해 도살하고, 성균관(成均館)과 한양 5부(部) 안의 24개 푸줏간, 300여 고을의 관아에서는 빠짐없이 소를 파는 고깃간을 열고 있다.”(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역, 돌베개, 2003, 81면)
나라 전체에서 하루에 소 500마리를 도살한다는 것이 과연 정확한 통계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 숫자로 보아 여러 가지 고기 중에서 쇠고기는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고기였을 것이다. 쇠고기는 위에서 든 바와 같이 국가의 제사, 호궤(?饋) 등에 소비되는가 하면, 뇌물로도 인기가 있었다. 물론 모든 쇠고기의 최후는 음식으로 요리되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특히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 쇠고기는 일종의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편 박제가의 시대, 즉 18세기 후반기가 되면 서울 시정에 술집과 음식점이 출현한다. 시정에서의 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생각해보면, 설렁탕과 너비아니는 서울 음식이 아닌가. 당시 서울 인구는 20만명에서 30만명 사이였으나,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 24개의 정육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다.
조선시대 푸줏간 풍경
이제 이 정육점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살펴보자. 앞서 인용했던 유본예의 ‘한경지략’ ‘시전’ ‘현방(懸房)’조다.
현방(懸房)-쇠고기를 파는 푸줏간이다. 고기를 매달아서 팔기 때문에 현방이라 하는 것이다. 도성 안팎에 모두 23곳이나 있다. 모두 반민(泮民)들로 하여금 고기를 팔아 생계를 삼게 하고, 세(稅)로 내는 고기로 태학생(太學生)들의 반찬을 이어가게 한다.
현방이란 쇠고기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푸줏간이다. 현방의 ‘현(懸)’은 원래 ‘달아맨다’는 뜻이다. 이것은 시전에 속하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정식 인허를 받은 공식적인 가게다. 현방은 도성 안팎에 23곳이 있다고 하는데, 서울 성곽 십리 안까지는 성저십리(城底十里)라 해서 한성부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에 23곳의 정육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관계없다. 다만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24곳이라 했는데, 유본예는 23곳이라 하고 있으니, 어떤 사정으로 1곳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방은 구한말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대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일제시대의 자료다.
지금은 고기 파는 집을 수육판매소(獸肉販賣所) 또는 ‘관(館)집’이라 하지만, 전일에는 ‘다림방’이라 하였다. 다림방은 한자로 ‘현옥(懸屋)’이니, 그때에는 소를 매달아서 잡는 까닭에 현옥이라 하였다. 그리고 현옥도 제한이 있어서 경성에 전부 오현옥(五懸屋)을 두었는데, 수표교 다림방이 가장 큰 것으로 수십년 전까지도 있었다.(‘경성어록(京城語錄)’, ‘別乾坤’, 1929년 9월호)
현방을 현옥이라 쓰기도 했고, 이것은 우리말로 ‘다림방’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경성에 전부 5곳의 현옥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일제시대 사람인 위 인용문의 필자의 기억에 그렇다는 얘기다.
이제 소를 도살하는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다. ‘경성어록’에 현옥(懸屋)도 제한이 있다고 한 말은 정육점의 허가가 자유롭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아마도 현방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제 ‘한경지략’의 “모두 반민(泮民)들로 하여금 고기를 팔아 생계를 삼게 한다”는 말을 음미해 보자. 이 말은 ‘반민’만이 서울 시내에서 소를 도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민은 백정인가? 그렇지는 않다. 황재문(黃載文)은 1949년에 쓴 글에서 반민에 대해 언급하면서 백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黃載文, ‘서울 동명에 숨은 이야기’, ‘民聲’, 1949, 11월호)
다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내의 소의 도살과 판매를 독점했던 반민(泮民)이란 도대체 어떤 부류인가?
반촌민은 안향의 노비 후손들
성균관을 다른 말로 ‘반궁(泮宮)’이라 한다. 반궁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고대로 소급한다. 주(周)나라 때 천자(天子)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벽옹(?雍)이라 하고, 제후의 나라에 설립한 학교를 반궁(泮宮)이라 하였다. 반궁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반궁이란 말의 내력은 또 어떤 것인가? 반궁은 ‘반수(泮水)’에서 온 말이다. 벽옹의 사방은 물이다. 쉽게 말해 큰 연못 속에 건물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벽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으로 놓은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에 비해 반궁은 동쪽 문과 서쪽 문을 연결하는 선 한편만 물이다. 즉 연못은 반달 모양이 된다. 천자의 벽옹에 비해 물이 ‘반(半)’밖에 되지 않는다. 이 물을 반수(泮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인 것이고, 반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반궁이라 부른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궁(宮)’은 궁전이란 뜻이 아니고, 단순히 건물이란 뜻이다. 이것이 성균관이 반궁이라 불린 내력이다. 이런 내력으로 인해 성균관과 관련된 곳에 흔히 ‘반(泮)’자를 붙였으니, 성균관 주위의 마을을 ‘반촌(泮村)’이라 하고 그곳의 주민은 반민(泮民), 반인(泮人)이라 불렀던 것이다.
반촌은 적어도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역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의 저명한 문인이자 학자인 서명응(徐命膺, 1716~87)이 쓴 ‘안광수전(安光洙傳)’(‘保晩齋集’ 9권)에 반촌의 유래와 반촌 주민에 관한 소상한 언급이 나온다.
반촌은 고려말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 자기 집안의 노비 100여 명을 희사하여 학교를 부흥할 것을 도운 데서 비롯된다. 본조(朝鮮)가 한양에 정도(定都)하여 국학(國學)을 옮기자, 노비 자손이 수천명이 되어 반수(泮水)를 둘러싸고 집을 짓고 살아, 거리와 골목, 닭울음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엄연히 하나의 동리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반촌(泮村)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그 자손들은 생장하면 반촌 밖을 나서지 않는다. … 총각이 되면 억센 자는 노름판을 돌아다니거나 협객 노릇을 하며, 인색한 자는 말리(末利, 상업)를 좇아 예교(禮敎)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안유는 곧 안향(安珦, 1243~1306)이다. 고려말기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했다는 인물이다. 그는 성균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유학의 진흥을 위해 충렬왕 30년(1304년) 5월 관료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성균관의 섬학전(贍學錢)을 조성하고, 이 돈의 일부를 중국의 강남에 보내 경전과 역사서 등을 수입하였던 바, 이로 인해 성균관의 교육 분위기는 일신되었던 것이다. 그 증거로 다음 달인 6월에 성균관의 대성전이 완성되어 학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니, 그는 고려말기 성균관의 부활운동을 주도한 인물인 것이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노비를 성균관에 기증했다 하여 이상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반촌민의 형성과 관련, 또 하나 사료가 윤기(尹햍, 1741~1826)가 남긴 시다. 윤기는 오랫동안 성균관 유생으로 성균관에 기거했던 인물인데, 그는 자신의 ‘무명자집(無名子集)’에 ‘반궁잡영(泮宮雜詠)’이란 220수의 독특한 한시를 남기고 있다.
그는 220수의 한시에서 성균관의 역사, 교육, 학생회 조직, 학생 처벌, 학생들의 집회, 결사 등등 성균관에 관한 거의 모든 일을 한시로 읊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사, 교육사, 풍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희귀한 자료인 것이다. 여기에 반촌과 반인에 관한 언급이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유약(有若)이신 안문성공(安文成公)은선성(先聖)의 초상과 경전을 사오시어 다시 학교에 두셨지.
백 명의 노비
후손들이 번성해
지금도 제단을 세워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드네.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붙어 있다.
“안문성공 향(向)은, 본명이 구슬 옥(玉) 변의 향(珦) 자인데, 어휘(御諱, 임금의 이름)를 피한 것이다. 고려의 찬성사(贊成事)로 학교가 쇠퇴하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에 돈을 보내어 선성(先聖, 공자)과 제자 70명의 초상, 그리고 제기(祭器)·악기(樂器)·경적(經籍)을 구입해 오게 하였다. 국학을 세우고, 노비 백 명을 바쳤는데, 지금의 반인(泮人)은 모두 그 노비들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반촌의 북쪽에 제단을 세우고 문성공의 기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애모와 정성을 바침에 있어 조금도 게으르지 않다.”
서명응의 ‘안광수전’과 같은 내용이다. 안향이 성균관에 기증한 노비의 후손들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서울로 따라와 서울의 성균관에 그대로 복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미심쩍은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명응과 윤기의 기록이 18세기 후반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안향으로부터 거의 5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이다. 반촌민(泮村民)이 유전학적으로, 아니 계보학적으로 500년 전 노비들의 후손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간에 임진왜란과 같은, 성균관을 잿더미로 만든 미증유의 사건이 있었음에랴. 하지만 조선 후기 반인들은 자신들이 안향의 노비의 후손이라는 점을 믿고 있었고, 또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던 것이니 무슨 상관이랴.
반촌의 형성 유래가 이러했으므로, 반촌의 거주자 반인(泮人)의 삶은 성균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대사성(大司成) 이하 관료조직과 교수진이 있었고, 유생들이 있었다. 이들을 위한 자질구레한 노역(주로 육체노동)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성균관은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의동인 명륜당(明倫堂) 이외에도 숱한 건물이 있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학교에서 먹고 자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기숙사(東齋·西齋)와 식당이 있었다. 이런 건물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반인들은 바로 이 성균관의 잡역을 세습적으로 맡아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다시 윤기의 시를 보자.
관비(館婢)의 소생은
직동(直童)이 되고
다른 계집종 자식은
서리(書吏)에 이름이 오른다네.
재직(齋直)은 장성여
수복(守僕)이 되니
반인(泮人)들이 지는 역은
본디 길이 다르다네.
여기에도 주석이 붙어 있다.
“이것은 반인(泮人)들의 신역(身役)이 각각 다름을 읊은 것이다. 관비의 소생은 재직(齋直)이 되고, 다른 계집종에게서 난 자식은 서리(書吏)가 된다. 재직은 장성하면 수복(守僕)이 된다. 반인들도 그 신역이 각각 다른 것이다.”
반촌의 남자가 성균관 소속의 계집종과 관계하여 자식(아들)을 낳을 경우, 그 자식은 성균관의 직동이 된다. 직동은 재직인데, 재직이란 성균관의 기숙사인 동재·서재의 각 방에 소속되어 유생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재직(직동)이 장성하면, 성균관 내의 제향에 관련된 육체노동을 맡는 수복이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반인이 관계한 여자가 성균관 이외의 계집종이라면, 그 자식은 서리가 되는 것이다. 이때의 서리 역시 성균관의 서리일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반인의 사회적 지위란 대단히 낮은 것이었다.
조선후기의 문인 이옥(李鈺, 1760~ 1813)의 ‘호상관각력기(湖上觀角力記)’란 글을 보면, 호상인(湖上人), 곧 마포 일대의 주민들과 반인들이 마포 북쪽의 도화동(桃花洞)에서 씨름을 겨루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상인이란 마포 일대의 짐꾼이나 막노동자들이었으니, 반인들의 사회적 지위란 이들에 상응하는 사회의 저층이었던 것이다.
반촌의 반인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균관과 공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생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반촌은 평소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방을 잡아 공부하는 하숙촌인가 하면, 과거철이면 거자(擧子)들이 주인을 정하여 머무르는 일종의 여관촌이기도 하였다. 정조 5년 11월4일 사성(司成) 채정하(蔡廷夏)는 과거철이 되면, 성균관 유생들의 절반은 성균관에 머물면서 성균관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절반은 반촌에서 기식하고 있다면서 성균관 식당의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정조실록’ 5년 11월4일).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반촌에서 머무르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식당의 정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보다 훨씬 전인 신임사화 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기지(李器之)도 기해년 봄 증광 초시(增廣初試) 때문에 반촌(泮村)에 나가 거접(居接)하여 여름을 넘기고 가을로 접어들 때까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경종실록’ 2년 5월5일). 아마도 기숙사 식당의 밥보다는 하숙집 밥이 나아서였을까. 아니면 기숙사의 딱딱한 규정을 지키기 싫어서였던 것인가?
이념서클의 온상
하숙촌이 된 반촌이 빚어낸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이승훈(李承薰)과 정약용(丁若鏞)의 천주교 학습 사건이다. 1787년 10월 이승훈과 정약용, 강리원(姜履元) 등은 과거 공부를 핑계대고, 반인(泮人) 김석태(金石太)의 집에 모여 ‘진도자증(眞道自證)’ 등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다가 이기경(李基慶)에게 발각된다. 이 사건이야 천주교사에서 널리 다루는 것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성균관 일대의 하숙촌이 일종의 이념서클의 온상 같은 역할을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여간 흥미롭지 않은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반촌 사람 김석태의 제문이 다산의 문집에 ‘숙보(菽甫)의 제문(祭文)’(숙보는 김석태의 자)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읽어보자.
지극한 정성은 하늘에 통하고 지극한 정은 땅까지 통하였네. 깬 것도 나를 위해 깨고 자는 것도 나를 위해 잤었네. 가정에 소홀하면서도 나를 위해서는 치밀하였고 달리고 쫓는 일에는 동작이 느렸으나 나를 위해서는 빨랐네. 나의 잘못을 남이 지적하면 칼을 뽑아 크게 성내었고 사람이 나와 잘 지내면 그를 위해 온 힘을 다 쓰더니, 혼마저 천천히 감돌며 아직 내 곁에 있네.
구원(九原)이 비록 멀다고 하나 앞으로 서로 생각하리.
반촌인의 이름이 좋은 의미로 기록에 남은 것은 김석태가 유일한 경우이리라.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인물에 대한 다산의 제문이 여간 다정스럽지 않다. 다산의 인품을 보는 듯하다.
자, 그렇다면 반촌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고려사’에 반촌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아마 반촌이란 말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또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조선 전기 문헌에서도 반촌이란 명사를 본 적이 없다. 오직 ‘선조실록’ 39년 6월15일조 기록에 무슨 일로 성균관 노비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령(使令)들을 ‘반촌(泮村)’에 곧장 보내어 성묘(聖廟)의 내정을 시끄럽게 했다는 말이 나온다. 선조 39년이면 1606년, 임진왜란 이후이다. 임진왜란을 거친 뒤 성균관이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성균관 일대의 마을을 반촌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확언할 수는 없다.
반촌에서 소를 도살하게 된 기원 역시 정확하지 않다. 조선 전기에는 유관한 기록을 찾기 어렵고, 17세기 말에 와서야 비로소 반촌과 소의 도살에 관한 자료가 보인다. ‘숙종실록’ 24년(1698) 1월21일조에 호조 판서 이유(李濡)가 반인(泮人)들에게 2개월을 한정하여 도살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사료가 있으니, 적어도 숙종 연간에 오면 반인이 국가의 공인을 얻어 소의 도살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 소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 이 시기에 와서 반인이 소의 도살과 쇠고기 판매에 종사하게 되었는지도 역시 분명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추정하자면, 반촌민의 도살은 성균관 학생들의 식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종실록’ 7년 10월30일조에 의하면, 원래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쇠고기를 반찬으로 제공한 것이 오랜 유래였는데, 성균관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 회의를 열어 결정을 보았던 바, 재(齋, 기숙사)와 명륜당에서는 먹고 식당에서는 먹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좀 유별난 짓거리가 아닌가 하는데, 과연 이 기사를 쓴 사관은 당시 사람들이 학생들의 행동이 특이한 체하는, 즉 뭔가 튀어보려는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전하고 있다. 어쨌건 성균관 유생들의 식사에 쇠고기를 제공하는 관습은 오래된 것이고, 이 때문에 반촌민들에게 소의 도살이 허락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반촌민들이 이를 계기로 서울 시내 쇠고기의 판매를 전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인용했던 유본예의 ‘한경지략’ 현방조에 “성균관의 노복들로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하게 하고, 세로 바치는 고기로 태학생들의 반찬을 이어가게 한다”고 한 말은 역시 이런 내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응란교 이북이 반촌
이제 쇠고기와는 결별하고 이 반촌민의 특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늦었지만, 반촌의 위치를 챙겨보자. 반촌은 그 범위가 정확하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 1916년 3월11일부터 3월26일까지 실린 ‘경성행각(京城行脚)’이란 기사에 의하면,
그 위치는 이렇다.
현금 경성식물원 입구 길 옆에 한 개의 석비(石碑)가 있으니, ‘응란교(凝? 橋)’라 새겨져 있다. 이것은 정조대왕이 이곳에 다리를 놓게 하시고, 그 곁에는 연지(蓮池)를 파서 부근의 풍경을 돕게 하심이니, 지금은 연지도 없고 다리의 흔적도 없으나, 석비만은 홀로 남았으며, 이 석비의 북쪽은 반인(泮人)이 거주하는 곳이요, 이남은 보통 인민의 주거지로 구별하였다.
경성식물원은 지금의 서울대병원과 동숭동 대학로 자리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경모궁(景慕宮)터였다. 19세기 서울 지도를 보면, 창경궁 오른편에 경모궁이 그려져 있고, 경모궁의 오른쪽 위편에 궁지(宮池) 또는 연지(蓮池)라는 이름의 연못이 보인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이것이 정조가 세운 응란교다. 이 응란교 이북이 반촌인 것이다. 윤기의 ‘반궁잡영’을 보면 좀더 정확하다.
하마비 남쪽에
길 하나 가로로 뚫렸으니,
반촌의 경계는
여기서 분명히 정해지네.
지금 돌을 세워
표시한 곳 어디메뇨.
경모궁 연지의
연꽃이 핀 곳이라네.
‘매일신보’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시에도 주석이 있다.
“옛날의 반촌은 관현(館峴)에서 혜화문에 이르는 길을 경계로 삼았는데, 당저조(當흦朝, 정조)에 경모궁 앞 연지 가에 돌을 세우고 반촌의 경계로 삼았다. 연지 이북이 모두 반촌이다.”
원래 관현에서 혜화문에 이르는 길이 반촌의 하한선이었으나(관현은 어디인지 미상), 정조 때 경모궁의 연지를 반촌의 하한선으로 삼았던 것이다. 반촌은 또 동반촌과 서반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성균관 쪽에서 경모궁 방향으로 곧장 내려오는 시내를 따라 난 길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은 동반촌, 왼쪽은 서반촌이 된다. 서반촌의 시작은 지금의 창경궁 월근문(月覲門) 앞의 박석고개부터다.
이상이 반촌의 지역적 구획이다. 그러나 이 구획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곳은 반촌민이 아니면 거주를 허락하지 않는 특별 구역이었던 것이다. 앞서 인용했던 ‘매일신보’의 ‘경성행각’을 다시 들추어보자.
반인이라 함은 즉 속설(俗說)에 소의 도살을 생업으로 삼는 자를 칭하는 일종의 대명사다. 그러나 이 명칭이 어느 시대부터 시작되었는지 상고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소문 안 부근 일대의 주민은 금일까지도 소 도살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옛날에는 그 수가 곱절이나 많았음은 정칙(定則)이다. 그러나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 서로 교제와 혼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므로, 이 부락의 주민은 세인(世人)의 압박과 수치와 결교(結交)·혼인의 불허 등의 모욕을 당하는 관계로 인하여, 자연히 분개심을 야기하고 분격심이 일어나는 때에 이곳 주민들은 일체 단결되어 남을 위하여 의리를 세우는 데 생사를 돌아보지 않는 기개가 있었으며, 옛날에는 다른 동 사람으로서 이 동에 들어올 수도 없었으며, 이 동 사람이 다른 동으로 이사 가서 사는 일도 없어서, 일개 별천지를 형성하였다.
반촌은 외부인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은 일개의 별천지였던 것이다. 이런 풍습이 언제 형성된 것인가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영조 때에는 이미 사회적 약속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조실록’ 19년 11월6일 지평 조재덕(趙載德)은 외인의 입주가 불허된 반촌을 재상의 아들들이 점거하였다고 조사해 치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조선후기의 모든 금란(禁亂)에도 반촌만은 들어가서 조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란이란 조선이 500년 동안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던 소나무의 벌채 금지, 임의적 도살의 금지, 양조(釀造)의 금지, 곧 금송(禁松), 금도(禁屠), 금주(禁酒) 등이 주종목인데, 범인이 반촌에 숨어버리면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반촌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대였던 것이다.
‘영조실록’ 6년 10월11일 우의정 조문명(趙文命)의 말을 들어보자.
“형조 판서 김취로(金取魯)의 말을 듣건대, 반인(泮人)이 한 짓이 매우 해괴하다 합니다. 북부(北部)의 장의동(壯義洞) 주위에 금송(禁松)의 정령(政令)이 행해지지 않기에 사람을 시켜 살펴봤더니, 반인의 무리가 생솔을 함부로 베어가기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 도끼로 사람을 찍고 성을 넘어 도주하여 그대로 반촌(泮村) 안에 숨었는데, 모든 금란(禁亂)에도 반촌엔 감히 들어갈 수 없었기에 잡아낼 길이 없다 하니,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원래 서울 시내에서 소나무를 베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바(서울의 나무장수는 서울 시내에서 벤 나무를 판매하지 못한다) 반인이 장의동 주변의 생솔을 베어갔고, 체포하려 하자 도끼를 휘두른 뒤 반촌 안으로 도피했던 것이다. 일단 반촌 안으로 들어가면 금란이 미치지 못한다. 포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성균관 유생들의 단식투쟁
영조는 성균관 대사성에게 반촌을 뒤질 것을 지시하지만, 이번에는 성균관에 기식하고 있는 유생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 권당(捲堂)이 그것인데, 이것은 식당에 들어가 식사하기를 거부하는 단식투쟁이다. 성균관 유생은 항의할 일이 있으면 종종 권당을 한다. 영조가 좋은 말로 달랜 끝에 유생들은 스트라이크를 풀었다.
실제로 성균관 근처에서 도둑을 체포하였다가 포도대장이 파직된 경우도 있었다. ‘영조실록’ 41년 5월13일조에는 사간원에서 포교(捕校)가 반촌(泮村)에서 도둑을 잡았는데, 성묘(聖廟)가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포도대장의 파직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반촌이 이렇게 독특한 구역이 된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포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성묘(聖廟), 곧 대성전이란 성화(聖化)된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반촌민이 다른 지역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점도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즉 반인들의 신분이 백정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소의 도살과 판매에 관계하는 이상 천대를 받았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이로 인해 반촌민은 반촌 바깥 사람들과 친교, 결혼 등 일체의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이다. 반촌은 사실상 게토(ghetto)였던 것이다. 이것이 반촌을 특수한 구역으로 만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게토화로 반촌민들은 독특한 에토스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용했던 서명응의 ‘안광수전’의 “억센 자는 노름판을 돌아다니거나 협객 노릇을 한다”는 구절도 그런 의식의 일단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매우 폭력적인 것인데, 실제 그런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정조 1년 7월15일 반인(泮人) 정한룡(鄭漢龍)이 환도(環刀)로 사람을 공격하여 무릎뼈가 절반이나 떨어져나갔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그 상해로 인해 치명(致命)한 사건으로 인해 살인으로 성옥(成獄), 살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양반이나 보통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은 아니다.

이제 반인들의 독특한 에토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윤기의 ‘반궁잡영’이다.
반인은 원래
멀리 송도(松都)에서 온 사람들
여자의 곡소리는 노래와 같고
사내의 옷차림은 사치스럽네.
호협(豪俠)한 성미에
연(燕)나라 조(趙)나라의 기미를 띠고
풍속이 괴이하여
서울과도 다르다네.
이 시의 주석을 보자.
“반인은 원래 송도(開城)에서 이사해 온 사람들이다. 때문에 그들의 말씨와 곡성은 송도 사람들과 같다. 남자들의 의복은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예사 사람과 다르다. 기절을 숭상하고 협기(俠氣)가 있어,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왕왕 싸움이 일어나면, 칼로 가슴을 긋고 허벅지를 찌른다. 풍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반인들의 말씨와 곡소리가 개성 사람의 곡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들이 개성 출신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서울과 다른 말씨는 이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이옥은 ‘방언’이란 글에서 반촌인의 말을 이렇게 구별짓고 있다.
“한성(서울)은 나라의 한복판이고, 한성의 한복판에 주민들이 있다. 그 소리치고 대답하고 울고 말하는 것이나 만 가지 물건들에 붙이는 이름이 여느 백성들과 달라, 그들을 구별하여 ‘반민( ?民, 泮民과 같음)이라고 한다.”
특이하지 않은가? 음조가 다를 뿐 아니라 사물의 이름도 일반 백성들과는 구분되었다고 하니, 일종의 특수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핵심지역이라 할 성균관 일대가 마치 섬처럼 고립된 언어지역이었던 것이다.
특수방언 사용한 반인
또한 남자들이 사치스러운 복색과 호협한 기질,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여러 문헌이 증언하고 있다. 이 폭력성을 순화시키기 위한 움직임까지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서명응이 전기를 쓴 안광수(安光洙, 1710~65)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안광수 역시 반촌 사람이다. 다만 안광수가 순수한 반인(泮人)인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안향과 같은 성씨인 순흥(順興) 안씨라는 것, 그리고 서명응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무반직(武班職)을 가졌고(정3품 절충장군이었다. 물론 이것은 보잘것없는 무반의 품계다), 또 그의 선조가 반촌에 흘러들어와 살았다(寄居)고 했으니, 원래 반촌의 토박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그의 행적을 보면 글깨나 읽은 지식인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안광수는 “태학은 수선지지(首善之地)인데, 풍속이 이와 같아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자제들 중 똑똑한 사람 70여 명을 불러모아 제업문회(齊業文會)란 이름의 계를 만들었다. 말이 계지 이것은 학교였다. 그 학생들의 능력에 맞추어 경사자전(經史子傳)을 가르치고, 사친(事親) 경장(敬長)의 도리를 일깨웠다. 이뿐이랴. 관혼상제도 몰라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것을 가르쳤다.
안광수는 유능한 교육자였다. 그는 여유를 갖고 살아야 기상이 좁아지지 않는다면서 맑은 날, 경치 좋은 곳을 골라 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나가,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하루를 보냈던 것이다. 또 상을 당하자 소식(疏食)으로 삼년을 지내고, 주야의 곡읍을 비록 병이 심하게 나도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고 하니, 그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에 반촌의 자제들이 감화되어 그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안광수의 제자들은 성균관의 서리가 되고 수복이 되었던 바, 그들은 모두 성균관의 업무에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 었던 것이다. 안광수가 죽자 반촌 사람들은 그의 제자건 아니건 남자건 여자건 애통해하면서 그의 장례를 도왔다. 또 제자들은 그를 기념하여 기일 생일 사시의 절기마다 제수를 마련해 제사를 도왔다고 한다.
나는 안광수란 인물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유가(儒家)의 예에서 벗어나 있던 부류들의 독특한 성격이 유가의 예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 되레 서글픔을 느낀다. 하지만 ‘안광수전’은 원래 반인의 독특한 성격을 반증하는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안광수전’을 통해 유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제할 수 없었던 인간의 원래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흥미로운 것이다.
성균관 몰락과 함께 사라진 반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교육제도가 시행되자 성균관은 옛날의 위상을 잃고 중세의 유물이 되었다. 성균관이 무너지자 반촌도 따라서 해체되었다. 신분제의 붕괴와 함께 반촌 사람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차별 역시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1920년대 신문기사에 의하면, 반인들은 여전히 소의 도살과 쇠고기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차별과 싸우기 위해 교육사업에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1910년 보통학교 과정의 사립 숭정학교를 세워 반촌의 아동들을 가르쳤다. 특기할 것은 이 학교는 재정이 전혀 곤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차별을 생각해 쇠고기 판매 금액의 일부를 내놓아 학교의 재정을 충당했으니, 지방에 이사해 살더라도 숭정학교를 위한 헌금은 우편으로 부칠 정도로 열성이었다는 것이다.
신분제가 사라진 이 시대에 반촌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의미가 없을까.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돈과 권력, 학벌, 출신지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여전하다. 돈과 권력의 보유 정도에 따라 사는 곳 역시 경계가 지어져 있다. 서울 시내에는 지금도 반촌과 같은 게토가 존재한다.
이상한 일이다. 쇠고기는 모두 먹기 좋아하지만,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인도에서도 소를 잡는 사람은 모두 천한 사람이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 농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도 농민의 사회적 지위는 왜 늘 낮은가.
이뿐이랴.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왕과 양반처럼 고귀한 사람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큰 사고를 낸 사람이어야 한다. 홍경래처럼, 임꺽정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역사는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까? 불과 몇 십년을 지나지 않아 나와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 될 것이다.
반촌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다. 게토(ghetto) 속에 살던 이들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반촌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챙기면서 영웅의 열전이 아니라, 그런 잊혀진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고 싶다는 욕망이 끓어오른다.
왕들은 예외없이 금주령을 시행했고 함정 단속도 이뤄졌다.
그럼에도 개국 초부터 폭음문화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했다.

근자에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거의 먹지 않는다. 본의 아닌 금주를 하게 되자, 술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그래서 술에 대한 갈망을 조선시대의 음주와 주점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한다.
술에 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저도 있다. 변영로의 ‘명정사십년(酩酊四十年)’과 양주동의 ‘문주반생기(文酒半生記)’는 이 방면의 포복절도할 쾌저(快著), 명저가 아니던가? 여타 문인들의 소소한 음주기(飮酒記)를 더러 읽어보았지만, 모두 이 두 명저에 몇 걸음을 양보해야 하리라. 하지만 이 책에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음주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술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또 술집은 언제 생겨난 것인가? 이 물음에는 아무도 답해 주지 않는다. 답답하다.
술은 역사적인 사회학적 고찰을 요하는 어휘다. 한국 기업의 접대문화는 술과 분리할 수 없는 바, ‘술상무’란 말에는 20세기 후반 한국이 경험했던 압축적 산업화·근대화가 각인되어 있다. 또 지금 한국의 거창한 향락산업 역시 술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뿐인가. 술은 거대한 세원(稅源)이니, 곧 국가경제의 문제다. 음주 허용연령은 청소년 문제와 연관된 사회학적 문제다. “여자가 술을?”이란 의문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술단지의 밑바닥에 사회, 역사, 경제, 문화가 녹아 있다. 조선시대의 술집과 금주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식량확보 위해 금주령 발동
국가 권력이 음주를 향한 욕망을 꺾어버린다면, 즉 앞으로 1년 동안, 혹은 석 달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술을 마실 경우 감옥에 가둔다면, 또한 이런 조치가 수시로 발동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선시대엔 이런 적이 많았다. 국가는 자주 금주령을 발동하여 개인의 음주를 금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알코올은 주로 곡물과 과일에서 얻기 때문이다. 벌꿀이나 용설란 같은 것이 없지는 않지만 대종을 이루는 것은 역시 곡물과 과일이다.
술은 곡물을 ‘낭비’한다. 말하자면 주 식량을 낭비하는 것이다. 술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밥은 먹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경제체제가 전적으로 농업 위주였던 조선시대에 곡물의 안정적 확보는 곧 정치-경제 체제의 안정과 연결되는 문제였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물의 낭비는 곧 많은 사람들의 아사를 불러온다. 그러니 곡물이 술로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쌀로 막걸리를 담글 수 없었다.
즉, 조선시대엔 흉년이 되는 해에 금주령이 강하게 발동되었던 것이다.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와 같은 재난, 국상 등이 있으면 전국민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금주령이 발동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조선에선 500년 동안 금주령이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유지됐다.
그렇다면 조선의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술의 유통을 통제했을까. ‘태조실록’ 7년 5월28일조엔 전국 각도에 술을 금하는 영을 거듭 엄하게 내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것이 조선시대 최초의 금주령이라 여겨진다. 물론 그 구체적 내용은 미상이다. 태종 때도 금주령이 잇따라 시행됐다. “금주령을 내렸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늙고 병든 사람이 약으로 먹는 것과 시정에서 매매하는 것도 모두 엄하게 금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태종 10년 1월19일).”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였다. ‘금주령을 먼저 세민(細民)에게 행하고, 거가(巨家)에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술을 팔아서 생활의 밑천으로 삼는 자도 있으니, 공사연(公私宴)의 음주 이외는 금하지 말라’(태종 12년 7월17일).” “공사의 연음(宴飮)을 금지하였다. 환영과 전송에 백성들이 탁주를 마시는 것과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는 금례(禁例)에 두지 말게 하였다(태종 15년 1월25일).”
조선시대 금주령은 대개, 중앙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각 지방 행정기관들이 이를 받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금주령은 개국 초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강력하게 시행된 법령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이어서 금주령의 이유(보통 흉년 가뭄), 금주 기간, 금주령의 적용대상 범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금주령의 적용대상 범위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태종실록’ 7년 8월27일조 사헌부의 말이다.
“① 각사(各司)의 병술(甁酒)과 영접·전송,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다탕(茶湯)을 빙자하여 허비하는 따위의 일은 일절 금지하고, 조반(朝班)과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어지럽게 구는 대소 원리(大小員吏)를 또한 규찰하게 하되, ② 다만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과 시정에서 술을 팔아 살아가는 가난한 자는 이 범위에 넣지 않게 하소서.”
①이 금주의 대상이고, ②가 제외의 대상이다. 늙고 병든 사람이 술을 약으로 마시는 경우, 가난하여 술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는 금주령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금주의 범위는 늘 가변적이다. ‘세종실록’ 2년 윤1월23일의 실록 기록에 따르면, 금주령 기간 이라도 부모 형제의 환영 전송, 혹은 늙고 병든 사람의 복약(服藥), 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술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에서 제외되었고, 오로지 놀기 위하여 마시는 경우, 부모 형제가 아닌 사람을 영접 전송하면서 마시는 것, 또 이들에게 술을 판 경우는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금주의 범위는 사회적 상황, 정책 담당자의 성격, 임금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예컨대 무사들이 활쏘기 연습을 할 때 음주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한 국정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세조실록’ 4년 5월10일, ‘성종’ 9년 5월29일). 음주를 허용하자는 측은 활을 쏠 때 술의 힘을 빌려야 잘 맞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 경우 음주 허용과 불가 방침이 반복됐다. 조선시대 금주령은 결론적으로 약을 먹을 때 마시는 술과 혼인·제사 때 마시는 술은 대체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성종실록’ 14년 3월6일).
금주령은 강력했지만 실제 단속에 걸려드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뿐이었다. ‘청주(淸酒)’를 마신 자는 걸려들지 않고, ‘탁주’를 마신 자는 걸려들어 처벌을 받는다 했으니(‘세종실록’ 2년 윤1월23일), 요즘으로 치자면 양주를 마신 사람은 괜찮고 소주를 마신 사람은 걸려든다는 얘기다. “금주령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고 고대광실에서 호사를 떨며 술을 즐기는 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세종실록’ 8년 2월23일)거나, “가난뱅이는 정말 우연히 탁주 한 모금을 마시다 체포되고, 세력과 돈이 있는 자는 날마다 마셔도 누구도 감히 입을 대지 못했다”(‘세종실록’ 11년 2월25일)는 데서 알 수 있다.
소주는 조선 상류층의 상징
금주령에서 특히 문제삼았던 것은 소주였다. 조선 건국 이후 체제가 안정되자 술은 점점 고급화되었다. 소주의 소비가 늘어났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소주는 지금과 달리 고급술이었다. 원래 소주와 같은 증류주는 알코올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곡식이 많이 소모된다. 세종 15년 이조판서 허조(許稠, 1369~ 1439)는 “내가 처음 벼슬길에 들어섰을 때는 소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집집마다 소주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세종실록’ 15년 3월23일). 허조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건국 초기에는 소주가 드물다가 세종 연간에 와서 소주를 마시는 풍조가 성행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성종 21년의 자료에 의하면, 세종 때는 사대부가에서도 드물게 쓰는 것이었으나 성종 때엔 연회에도 모두 소주를 사용하였다고 한다(‘성종실록’ 21년 4월10일). 소주를 마시는 것은 관청에서 시정에 이르기까지 풍습이 되었기에 소주를 만들거나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성종실록’ 22년 2월22일). 그러나 금지령이 지켜지는 것은 한때일 뿐 소주는 이내 다시 음용되었다.
소주의 유행에 ‘신래침학(新來侵虐)’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신래침학은 과거에 합격하여 처음 관청에 보직을 받아 출근하는 사람에게 고참들이 술과 요리를 요구하는 일종의 입사의식(入社儀式)이다. 신참은 고참들에게 값비싼 소주를 바쳐야 했다. ‘중종실록’ 19년 8월1일자에서 남곤은 “민간의 의식이 부족한 것은 술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소주를 만들기 위해 미곡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심하며, 소주는 특히 신래를 침학할 때 반드시 요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단순히 금주령만으로 술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을 의식화시키는 방법도 고안되었다. 금연 캠페인이 벌어지듯 음주의 해악을 지적한 책이 제작되고 보급되었다. 세종 15년의 일이다. 세종은 ‘계주윤음(戒酒綸音)’이란 책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했다(‘세종실록’ 15년 10월28일). 술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그 논리를 잠시 따라가보자. “술은 곡식을 썩히고 재물을 허비한다.” 이 대목은 설명이 필요 없다.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술을 마시면 평소 지키던 몸가짐을 잃는다는 얘기다. 유교가 국교이던 시기여서 예의 문제도 금주 캠페인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린다.”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봉양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다.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한다.” “해독이 클 경우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든다.” “해독이 작으면 성품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하게 한다.” 지나친 음주가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를 조선시대 세종 때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은 이 책을 서울과 지방의 관청에 보급하여, 족자로 만들어 관청의 벽에 걸어두고 늘 술을 조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술 최대 소비층은 양반
조선은 강력한 통제 사회였지만 금주령은 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조선 전기는 ‘음주의 시대’라 불릴 만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인 1585년 지평 한응인(韓應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즈음 여항(閭巷)에서는 대소귀천(大小貴賤)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연회에 절도가 없어 주육(酒肉)이 낭자하고 음악이 시끄러운 것이 태평하여 근심이 없을 때와 같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일절 금단하소서(‘선조실록’ 18년 4월29일).”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가 아닌 조선의 평화였다. ‘대소귀천’ 모두가 술에 빠져 있었다. 현재 한국의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실록은 대소귀천 운운하지만 술의 최대 소비자가 지배계층인 양반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술은 곧 곡식이었으니 궁핍한 백성들이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는 없었다. 근대 사회 들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값싼 술이 등장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도 알코올에 중독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오로지 곡식에만 의존해 살았던 중세의 보통 백성들에게 알코올은 너무나 값비싼 기호식품이었다.
각 관청에는 주고(酒庫, 술창고)란 시설물이 있었는데, 특히 서울 각 관청은 고위 인사의 영접 전송 때 모두 술을 사용했다. ‘중종실록’ 36년 11월13일조에 따르면 서울의 품계가 높은 아문과 육조 소속 각 관청에서는 자체 내에서 술을 빚어 술을 물처럼 마셨다. 이 때문에 원래 술 판매에 종사하던 각 관아의 노복(奴僕)들이 생업을 잃기도 했다. 또 서울 시내 각 시장에는 누룩을 파는 곳이 7, 8곳이고 거기서 하루 거래되는 술은 쌀 천여 석에 달했다. 약간의 과장이 섞였겠지만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흉년을 핑계로 관청의 주고를 혁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의 소비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아니다.
양반계급의 술 소비엔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는 양반관료 중심사회였다. 양반들은 성리학 이념에 투철한 도덕적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면일 뿐 양반은 지배계급으로서 사회적 특권과 쾌락을 누리는 데도 열중했다. 음주 역시 그 특권적 쾌락의 일단이었다. 요즘 골프를 치는 것이 상류층-중산층의 상징이듯 조선시대에 소주 마시는 것은 양반계급의 상징이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거의 200년간 평화를 누렸다. 크고 작은 정변과 외교적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장구한 평화는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었다. 긴 평화는 양반들의 음주벽을 진작시켰다.

그렇다면 조선 전기 사람들은 어디에서 술을 마셨을까. 상점 같은 곳에서 술을 사 집에서 마시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요즘의 카페나 룸살롱 같은 전문 술집에서 마신 것일까. 조선시대에도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술을 팔았을까. 상식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셨으므로 당연히 술집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를 무대로 한 사극 드라마를 보면 주막에서 주모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오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조선 전기의 경우 술을 판매한 상점은 있었지만 술집은 아마도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측’이라고 한 것은 이제까지 필자가 접한 문헌에서 술집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술집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업적 공간이 실제로 없었거나 그런 공간이 극히 드물었던 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방대한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전기의 술집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세종 16년 4월11일조의 ‘실록’에서 성균 생원(成均生員) 방운(方運)은 “백성들은 굶어죽는 일이 있으나 승려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굶어죽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
“급기야는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이 생겨 어떤 자는 찻집(茶肆)이나 술집에 나와 놀면서 스스로 서로 잘난 척하고 뽐내며, 어떤 자는 약한 백성과 서로 이익을 다투어 재물 모으기를 꾀하고, 처자를 끼고 먹이어 청정(淸淨)한 곳을 더럽히고, 추악한 행동을 드러냅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문젯거리다. 술집과 함께 찻집이라니! 찻집은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기서 등장하는 술집과 찻집은 아마 고려의 유풍이 아닌가 한다. 이 자료 이후 찻집은 물론 술집에 관한 기록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술을 마셨을까. 조선 전기 실록에는 ‘회음(會飮)’을 금한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회음이란 환영 전송 잔치 등의 기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일을 뜻한다. 아마 조선시대엔 회음이 가장 일반적 음주 형태였던 것 같다. 이 경우 술은 양조주(釀造酒), 즉 집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 주로 동원됐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청에서도 술을 빚었다. 술을 빚어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들에게 술을 사서 마시는 일도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 ‘태종실록’ 금주령에 관한 자료에서도 술을 빚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계 수단인 양조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나온다.
조선 전기 술의 판매 구조를 알기 위해선 병술이라는 말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술은 휴대용 술이란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집 밖에서 약을 먹기 위해 술이 필요한 경우 술을 병에 담아 휴대할 수밖에 없다. 병술에는 또 양이 적다는 의미도 있다. 병술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은 양의 음주는 굳이 금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병술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됐을까. 다음은 ‘옛날의 음식점’(김화진 저)의 한 대목이다. “바침술집은 주세를 내지 않고 임의로 술을 만들어 파는 집을 뜻한다. 대개 집 문간에 병이 그려져 있으며 ‘병술집’이라고도 한다.”
병술은 병술집(바침술집)에서 주로 판매됐다. 병술집은 오직 술을 병에 넣어 판매만 할 뿐이었다. ‘옛날의 음식점’에 나오는 자료는 조선 전기의 것이 아니고 19세기 말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시대의 사회 풍습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김화진의 증언이다. 믿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이 간단한 형태의 술 판매구조야말로 간단하기에 변화가 거의 없으며, 실록의 기록들에 의하면 그 유래를 조선 전기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침술집은 어원도 독특하다. 바침술집은 국어사전에는 ‘받힘술집’이 옳은 표기라 되어 있다. ‘받힘’은 ‘받히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받히다’는 현재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모개(전체)로나 도매로 팔다’는 뜻이다. ‘받힘술집’은 술을 많이 담가서 도매로 술장수에게 넘겨주는 술집이란 뜻이다. 국어사전은 여기에다 또 병술로도 파는 집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즉 받힘술집이라는 말엔 술의 제조창 겸 도매상 겸 소매상이라는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술과 안주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의 상업적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술집으로 불리는 주류판매업은 존재했다. 덧붙이자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어렸을 때 주전자를 들고 막걸리를 받으러 갔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병술집은 대개 이것과 동일한 것이다. 술을 받으러 가는 일의 역사는 400~ 500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술집은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출현했다. 하지만 술집에 관한 기록은 이때도 드물다. 술과 술집이란 그때도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상화된 것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기록에 남길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특히 술집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일단 이 점을 감안해두자.
술집이라는 단어는 ‘숙종실록’ 22년 7월24일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업동의 사건에 이 단어가 나온다. “방찬이 또 응선을 꾀어 술집에 가게 하여 취한 틈을 타서 방찬이 그 호패를 잘라서 주고 이홍발에게 갖다 주게 하였는데, 제가 그 말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업동의 사건은 매우 복잡한 것이나 여기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선 구체적으로 술집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 단지 술집이란 것이 숙종 22년에 존재했던 것만 확인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실록’ 4년 6월18일조 형조판서 서명균(徐命均)의 상소는 퍽 중요하다.
“듣건대, 근래 도민(都民)의 살길이 점점 어려워져서 술을 팔아 생업으로 하는 자가 날로 더욱 많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이 빚은 자는 혹 100곡(斛)이 넘기도 하였으나, 시가가 뛰어올라 폭력을 휘두르고 살상까지 한다 합니다. 차츰 금지하려고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하는 뜻으로 오부(五部)에서 감결(甘結·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보내던 공문)을 받았는데, 나라의 풍속이 두려워하고 와전되어 금란(禁亂)을 가탁하여 속이고 협박하며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가탁하는 자 두어 사람을 잡았더니, 바로 사헌부에서 내쫓긴 하인과 포도청(捕盜廳)에서 물러난 군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부터 술집에서 내기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그쳤는데 쌀가게에서 부르는 값은 갑자기 더하므로, 바야흐로 들어가 아뢰어 먼저 술 많이 빚는 자를 금하고 이어서 옛 제도를 더욱 밝히기를 청하려 하는데 승선(承宣)이 문득 폐단을 끼친다고 말하니, 폐단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백성에게 폐해를 가져온다는 뜻일 것입니다.”
술집이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술집에서 내기 술을 마시는 일’이란 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병술집이 아닌 주점을 뜻한다. 시정에 주점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년 전 영조는 붕당(朋黨), 사치와 함께 음주의 폐해를 신하들에게 간곡하게 언급하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훗날의 대사령 때에도 용서하지 말라고 명했다.
실록 자료에 따르면, 영조의 명으로 술집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진행됐다. ‘영조실록’ 4년 9월16일 사간 강필경(姜必慶)의 말에 따르면 술집의 영업행위는 단속으로 일시에 거의 종식된 듯했다.
“주금(酒禁)을 신칙(申飭)한 뒤로 술집으로 이름난 것은 모두 술 빚는 일을 끊었습니다.”
흥미로운 단속 사례도 있었다. “송교(松橋) 근처 큰 술집 하나가 있는데 내자시(內資寺)에서 도장을 찍은 첩자(帖子)를 높이 걸고 어공(御供)하는 술이라 청하여 법부(法府)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뜻대로 매매하여 꺼리는 것이 없으니, 내자시의 해당 관원을 먼저 파직하고 서원(書員)은 유사(攸司)를 시켜 가두고 처벌하소서.”
내자시는 대궐에 필요한 식료품 자재를 공급하는 관청이다. 송교의 큰 술집이 내자시와 결탁하여 어공(御供), 즉 임금에게 바친다고 속여 술을 빚어 팔면서 한성부·형조·사헌부 등 사법권이 있는 관청의 단속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힘있는 행정기관과 결탁하고 ‘청와대’를 사칭하여 법망을 피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내자시의 관원과 서원(書員, 書吏)들은 당연히 처벌되었다. 이후 영조는 금주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략 17세기 말쯤 시정에 나타난 술집은 영조의 가혹한 금주령으로 거의 사라졌다. 금주령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그래왔듯이 일시적인 것이었다.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발동했다가 식량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금주령을 푸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영조는 달랐다. 그는 그의 치세 기간 내내 강력한 금주 정책을 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려 했다. 국가의 제사인 종묘 제례에도 술을 쓰지 않았다. 민가에서도 제사에 술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이다. 영조는 1724년 8월부터 1776년 3월까지 53년간 재위하여 조선조 왕 중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길다. 금주단속이 무려 반세기 동안 실효성 있게 시행됐다는 의미다. 애주가들에게 영조 치세기는 세계사에서도 흔치 않은 탄압기였다. 영조의 강력한 금주령으로 인해 많은 소동이 벌어졌다. 첫째 과잉단속. 다음은 영조 9년 장령 안경운(安慶運)의 상소 내용이다.
포도종사관(捕盜從事官) 김성팔(金聲八)은 밤에 술집에 갔다. 그는 술집에 관한 정보를 듣고 단속하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
김성팔은 욕설을 퍼부으며 술집 주인을 심하게 구타했고 다음날 포도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술집 주인은 포도청 감옥에 갇혀 ‘절도범을 치죄할 때 사용되는 형’을 받은 뒤 죽었다. 일흔 살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 아흔 살의 조모 역시 상심, 비통해하다가 죽었다. 3대가 한꺼번에 죽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김성팔은 사형에 처해졌고 포도대장은 파직됐다. 이는 술집에 대한 과잉 단속으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사고였다(‘영조실록’ 9년 4월13일).
단속반의 비리도 잇따랐다. 영조 28년 우의정 김상로(金尙魯)는 금주령 이후의 폐단을 말한다. 금주령 이후 술집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형조와 한성부의 이속(吏屬)들이 ‘금란방(禁亂房)’이라는 술집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은밀히 술 파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뜯는다는 것이다. 김상로는 형조에 이 폐단을 개혁할 것을 요구했고 임금도 허락했지만, 단속반의 부정부패가 척결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영조실록’ 28년 12월20일).
함정 단속도 공공연히 행해졌다. 형조 낭관(郞官)은 몰래 사람을 술집에 보내어 술을 사서 마시게 하고 그것을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영조는 “이것은 형(刑)에 걸리도록 유도한 것”이라면서 형조 낭관을 파직했다(‘영조실록’ 32년 1월9일).
술 마시면 사형
영조의 금주령은 가혹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목이 달아난 공무원이 있을 정도였다. 금주령 위반죄로 참형을 당했던 윤구연(尹九淵)의 예를 보자. 영조 38년 9월5일 대사헌 남태회(南泰會)는 남병사(南兵使) 윤구연을 고발했다. “자신이 수신(帥臣)이면서도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금주령을 범하고 술을 빚어 매일 술에 취한다는 말이 낭자합니다.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 변방 장수의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영조는 “과연 들리는 바와 같다면 응당 일률(一律,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 어찌 파직에 그치겠는가?”라고 말하며 윤구연을 체포해 올 것을 명했다. 윤구연이 잡혀오자 영조는 숭례문 앞에 나아가 윤구연의 목을 직접 칼로 쳤다. 영조가 이렇게 성급했던 것은 사실 확인차 보낸 선전관이 윤구연이 있던 곳에서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를 가져와 대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술항아리의 술은 금주령 이전에 담근 것이었다(‘영조실록’ 38년 9월5일).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의 목을 벤 것은 전제군주의 횡포였다. 영의정 신만, 좌의정 홍봉한, 우의정 윤동도가 차자(箚子·상소문)를 올려 윤구연의 목숨을 구하려 하였으나, 영조는 비답을 내리지도 않고 세 정승을 파직했다.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의 신하들도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도리어 이들까지 벼슬이 떨어졌다(‘영조실록’ 38년 9월17일). 부수찬 이재간(李在簡)은 “사형을 너무 섣불리 집행했고 또 말리는 신하들을 파직한 것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항변성 발언을 하다가 졸지에 성환찰방(成歡察訪)으로 좌천되었다(‘영조실록’ 38년 9월18일). 윤구연은 사실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에 이후에도 그를 신원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려는 신하들의 요청이 계속되었으나, 그것이 실현된 것은 12년 뒤인 영조 50년 2월24일이었다. 이 날 영조는 윤구연에게 직첩(職牒)을 돌려주라고 명하였으니, 12년이나 지나 명예가 회복된 것이다.
영조의 금주령은 이렇듯 잔인한 것이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영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사형에 처해진 듯하다. 그러나 영조는 지나치다 싶었는지 이 조치만큼은 철회했다. 영조 39년 사헌부 지평 구상(具庠)은 “금주령을 범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영조실록’ 39년 6월23일). 영조는 이 말을 수용하여 “금주령을 범한 술의 양의 다과(多寡)로 등급을 나누어 죄를 정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다. 공포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1년 뒤 영조는 포도청에 “양반으로서 금주령을 범하고 술을 빚은 자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영조 때 서울 도성 안의 인구는 20만 이 채 안 되었다. 포도청은 성내를 수색하여 7명을 잡아 왔다. 영조는 “죽은 할아비에게는 (제사지낼 때) 감주를 쓰고 그 손자는 술을 마시니 명색이 사대부로서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라며 엄형을 가한 뒤 서민으로 강등시켜 절도(絶島)와 육진(六鎭)에 귀양을 보냈다(‘영조실록’ 40년 4월26일). 영조는 제사에도 술 대신 감주를 쓰게 했기 때문에 “죽은 할아비에게 감주…”라고 말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금주령을 완화하려는 신하들의 의도를 영조가 좌절시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영조는 금주령을 발동하면서 종묘의 제사에도 술을 쓰지 않고 감주를 쓸 것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정언(正言) 구상이 종묘에 술을 쓸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영조의 가혹한 금주령을 늦추어 보자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물론 영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상의 요청이 있고 난 뒤 영의정 홍봉한이 구상의 진언으로 인해 금주령이 완전히 풀린 것으로 소문이 나 술을 마구 담그고 거리에서 술을 파는 자까지 출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리고 금주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영조는 격노하여 도성을 뒤져 사람을 잡아들이게 했던 것이다.
영조는 사형을 면해주기는 했으나, 금주령을 어긴 사람들의 귀양행렬은 영조시대 내내 이어졌다. 영조의 서슬 퍼런 금주령은 신하들의 어떤 진언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조 40년 9월11일 정언 박상로(朴相老)가 금주령의 폐단을 10개 항목에 걸쳐 조리 있게 논박했으나 영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박상로만 사적(士籍)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처벌을 받았을 뿐이었다.
영조 때 술집에 ‘네온사인’ 등장
하지만 술이란 것이 애초에 없었거나 이슬람교처럼 종교적 설득이 병행됐다면 모를까 모든 사람이 술을 안 마시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영조 때에도 술꾼들은 여전히 숨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영조실록’ 46년 1월26일조 주강(晝講)의 한 장면이다. 주강이란 임금이 낮에 경연관을 불러 경전을 강독하고 정사를 토론하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불콰한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참찬관으로 참여한 승지 조정(趙晸)이 범인이었다. 영조는 강(講)을 하는 막중한 자리에 술 냄새를 풍긴다면서 앞으로 그를 벼슬에 서용(敍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조정은 술 냄새를 풍긴 죄로 요직인 승지 벼슬이 떨어진 것이다.
영조는 한익모(韓益謨)에게 물었다.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이에 한익모는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조는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장형을 가하게 했다. 또 주등(酒燈)을 켜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끝내 주등 켜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주등이다. 이것은 당시 술집을 알리는 징표였다. 요즘으로 치면 술집의 네온사인이다. 주등 운운은 곧 시정에 술집이 다시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영조는 죽을 때까지 술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당시의 조선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술을 마시려 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알코올을 목숨과 바꾸려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결국 영조의 ‘술 없는 나라 만들기’는 미완의 성공에 그친 셈이다.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했다. 정조는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 술꾼들에게는 복음이었다. ‘정조실록’ 6년 5월26일조에 금주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좌의정 홍낙성(洪樂性)은 “곡식이 허비되는 것이 술에 있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을 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조는 곡식을 줄이는 효험도 보지 못하고 백성들만 고생시킨다는 이유로 금주령의 발동을 거부했다. 정조는 영조 시절의 가혹한 금주령이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고 사실상의 효과가 없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조의 관대한 정책으로 술의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정조실록’ 6년 6월2일 첨지중추부사 정술조(鄭述祚)의 상소를 보자.
“팔도에서 술을 빚는 데 허비되는 것을 통틀어 계산하여 보면 이를 백성의 식량에 견줄 경우 삼사 분의 일은 될 것 같습니다만, 서울을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의당 반의 숫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방금 만백성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 낟알 하나가 금(金) 같은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함부로 무익한 곳에다 곡식을 허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대소의 제사와 장례에 필요한 것 외에 몰래 술을 많이 빚어서 여러 점포에서 판매하는 부류들은 일체 아울러 엄금하면 거의 폐단을 구제하는 데 일조가 되겠습니다.”
‘술을 많이 빚어 여러 점포에 판매하는 부류’가 출현했으니, 이것은 시정에 다수의 주점이 성업중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정조가 전혀 주금책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조실록’에도 정조의 금주령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의 한시적인 금주령으로 돌아가 있었고, 더욱이 금주령을 범했다 해서 목숨이 떨어지거나 귀양을 가는 일은 없었다.
술집은 이내 시정에 범람하게 되었다. 정조실록 14년 4월26일조 대사간 홍병성(洪秉聖)의 상소문에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 “국가를 다스리는 계책은 재정을 넉넉히 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는데, 식량을 낭비하는 것으로 술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근래 도성 안에 큰 술집이 골목에 차고 작은 술집이 처마를 잇대어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오로지 술 마시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풍교(風敎)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실로 하늘이 만들어준 물건을 그대로 삼켜버리는 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너무 심한 것은 제거할 생각을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나라의 금령을 알게 한다면 몇 달 안에 5부 안에서 몇 만 섬의 곡식을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작은 보탬이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큰 술집이 골목에 차고 작은 술집이 처마를 잇대었다고 한다. 술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술을 금지한다면 몇 달 안에 몇 만 섬의 곡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에서 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만하다. 그러나 정조는 “술로 곡식을 낭비하는 것이 비록 폐단이 되지만, 어떻게 온 나라가 술을 마시는 데까지야 이르렀겠는가”라고 말하고, 홍병성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조 이후 시정에 술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순조실록’ 3년 8월에도 사간 이동식(李東埴)은 “서울의 쌀은 모두 술을 만드는 집에 들어가고, 저자의 어육(魚肉)은 죄다 술집에 돌아가니, 근래에 물가가 오르고 백성들의 생활이 고생스러운 것은 주로 이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고종 때까지 금주령이 수시로 발동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순조실록’ 32년 윤9월17일에는 금주령을 어겼을 경우, 형조에서 처벌하는 상세한 규칙을 만들었지만 실효는 없었다. 영조 이후 한번 금주령이 완화되고부터는 다시는 이를 다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술집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갔다. 다음은 정조가 신임했던 채제공(蔡濟恭)의 말이다. “비록 수십 년 전의 일을 말하더라도, 매주가(賣酒家)의 술안주는 김치와 자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백성의 습속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신기한 술 이름을 내기에 힘써 현방(懸房)의 쇠고기나 시전(市廛)의 생선을 따질 것도 없이 태반이 술안주로 들어갑니다. 진수성찬과 맛있는 탕(妙湯)이 술단지 사이에 어지러이 널려 있으니, 시정의 연소한 사람들이 그리 술을 좋아하지 않아도 오로지 안주를 탐하느라 삼삼오오 어울려 술을 사서 마십니다. 이 때문에 빚을 지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시전의 찬물(饌物) 값이 날이 갈수록 뛰어오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일성록’ 18 서울대 도서관 1990년 544-545면).
이 희귀한 자료는 정조대의 술집에 대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채제공은 1720년에 태어났다. 이 자료의 연대가 정조 16년(1792) 9월5일이니, 그의 생애의 전반기는 영조 시대에 걸친다. 금주령이 삼엄했던 시절의 술집 안주란 사실 김치와 자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조 이후 금주령이 완화되고 술집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자, 술의 종목과 안주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새로운 술의 개발을 경쟁하고, 안주로 쇠고기, 생선 등 당시로선 고급 음식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술보다는 안주에 혹하여 파산하는 자가 있다 했으니, 술집의 영업은 날로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엔 목로주점 대유행
시정의 술집이 발달하면서 점차 그 종류도 다양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된 것이 없다. 하기야 누가 이런 이상한 주제에 관심을 갖겠는가? 그나마 내용이 가장 충실한 자료는 김화진의 ‘옛날의 음식점’이다. 여기서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까지 서울 안에 음식점은 목로술집·내외(內外)술집·사발막걸리집·모주(母酒)집이 전부이고, 이채를 띠고 여자가 조흥(助興)하는 술집은 색주가(色酒家)뿐이었다”고 말했다.
일단 김화진의 증언에 등장하는 술집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목로주점은 서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이다. 내외주점은 “(양반으로) 행세하던 집 노과부가 생계에 쪼들려 건넌방이나 뒷방을 치우고 넌지시 파는 술집”(이서구, ‘주막, 서민의 바아’ ‘세시기’, 배영사, 1969)이다. 색주가는 여자가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는 술집이다. 색주가에선 매매춘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발막걸리집’이란 사발막걸리를 파는 목로라는 것이 국어사전의 정의다. 사발막걸리는 사발 단위로 값을 정해서 판매하는 막걸리다. 사발막거리집은 목로주점의 형태이긴 한데, 막걸리만 팔고 안주로는 간단한 조리 음식만 판매하는 저렴한 간이주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주집은 모주를 파는 술집이다. 모주란 ‘술찌기를 거른 것’이다. “빈한한 자와 노동자의 양식이며, 추운 새벽과 해질녘에 일등 가는 요리”(李用基,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永昌書館, 1926, 56면)였다. 이것은 주로 술찌기를 다시 걸러 비지에 무청, 김치 따위를 넣어 끓인 전골을 안주로 하여 먹는 노동자의 술이었던 것이다.
김화진이 ‘옛날의 음식점’을 집필한 연대는 1967년이다. 따라서 7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김화진이 태어난 1895년이다. 즉 그의 증언은 구한말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구한말에 이 다섯 가지 술집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술집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술집 중에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문헌에서 확인되는 술집은 목로주점과 색주가뿐이다. 신윤복의 풍속화에 목로주점이 등장한다.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19세기의 저작이다)에는 “젊은 계집이 있는 술집을 색주가(色酒家)라 한다”는 말이 있다. 색주가는 적어도 19세기에는 확실히 존재했으며 더 소급해 18세기 후반경에 생긴 것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을 듯하다. 이는 정조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전 영조 때 강력한 금주령이 시행됐음을 고려했을 때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영조 이전 상황은 알 수가 없다.
내외주점과 사발막걸리집, 모주집의 기원은 미상이다. 이서구의 ‘주막, 서민의 바아’는 내외주점의 출현 시기를 개화기로 잡고 있는데, 이서구의 이 글 자체에 오류가 많아 미심쩍기는 하지만, ‘황성신문’ 등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온 신문에서도 처음으로 내외주점이란 단어가 보인다. 아마도 그 문헌적 증거의 상한선은 19세기 말이 될 것이다.
폭음문화 경고한 연암 박지원
술집에 대해 실학자 등 당대 사상가들은 날카로운 비평을 했다.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술집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흥미롭다. 박지원은 1780년 7월10일 중국 성경(盛京)에 도착하여 그곳의 주루(酒樓)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는 중국 술집의 큰 규모와 화려함과 운치에 충격을 받는다. 문득 서울의 술집이 생각난다. 그는 서울의 술집을 이렇게 쓴다.
“우리나라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은 천하에서 가장 독하고, 이른바 술집이란 것은 모두 항아리 입 같은 창에 새끼줄로 만든 문지도리가 있다. 길 왼편의 작은 각문(角門)에 새끼줄 발을 드리우고, 쳇바퀴로 등롱(燈籠)을 만든 것은 틀림없는 술집이다. 우리나라 시인들이 흔히 말하는 푸른 깃발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술집 등마루에 꽂힌 깃발 장대를 도무지 본 적이 없다.”
조선의 술집은 항아리 입구처럼 생긴 들창에 새끼로 지도리를 만든 문이 있고, 길 옆 작은 각문에 새끼로 발을 늘이고 쳇바퀴로 등롱을 만들어 달아 술집임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영조 말년 실록에 나왔던 주등이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는 술집의 깃발은 시의 관습적 표현이지 실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화려하고 거창하고 청결한 술집을 본 연암에게 조선의 술집이란 것이 눈에 찰 리가 없었던 것 같다. 중국의 명사와 벼슬아치들은 기생집과 술집에 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술집은 조정의 벼슬아치들이 퇴근길에 들르는 곳이요, 명사들이 몰려들어 술 취한 김에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다. 조선의 술집 문화는 어떠했을까.
“술 마시는 양만은 너무나 커서 큰 사발에 철철 따라 이맛살을 찌푸리며 들이켠다. 이는 무작정 술을 쏟아 붓는 것이지 마시는 것이 아니고, 배를 불리려는 것이지 흥취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마셨다 하면 취하고, 취했다 하면 술 주정이고, 술 주정을 했다 하면 싸움질이고, 싸움을 벌였다 하면 술집의 술항아리며 술잔을 죄다 걷어차 깨어버린다. 이른바 풍류를 즐기는 문아(文雅)한 모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풍류와 문아한 술자리는 되레 술 배를 불리는 데 무익하다고 비웃는다. 이런 술집(골동품과 화초로 장식된 중국 술집)을 우리나라에 옮겨온다 해도, 하루 저녁을 못 넘기고 그 골동품은 부서지고 화초는 꺾이고 밟힐 것이니 이것이 가장 애석한 일이리라.”
연암의 시각에선 술집에서 고상한 풍치는커녕 술을 뱃속에 쏟아 붓고, 주정을 하고 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술집을 마구 부수는 것이 조선 말 술집의 풍경이었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이 언제나 현실을 어둡게 묘사하듯, 열렬한 개혁주의자 박지원은 역시 화려 무비한 중국을 보았기 때문인지 조선의 것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금속화폐 발달로 술집 번창
한편으로는 17세기 말에 이미 조선의 대표적 지성인이 국민들의 ‘폭음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끌기도 한다. 요즘 한국사회에도 ‘폭탄주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과 관련지어 음미해볼 만한 대목이다. 17세기 말에도 폭음은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났어도 한국인의 폭음 습성이 별반 달라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다.
숙종조에 모습을 보인 시정의 술집은 영조 치세의 혹독한 금주령에 의해 일시 위축되다가 18세기 후반 정조 때에 와서 번성하게 된다. 술집 문화가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발전에 있을 것이다. 자급자족 경제 체제에서는 주점의 호황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술을 사서 마신다는 것은 금속화폐의 발달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18세기는 조선시대 경제적 융성기였다.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됐고 대동법과 균역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도시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기술적 진보로 인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일부 계층에 생활의 여유를 가져오게 했고 급기야 시정의 술집타운까지 출현케 했던 것이다.
세도가의 자제는 천자문을 몰라도 합격했다. 임금이 직접 주관한 과장에서도 술판, 싸움판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암행어사 박문수도 대리시험으로 장원급제했다는 소설까지 나왔다.

요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수의 서울대생들이 전공 불문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만의 현상도 아니다. 전국 대학마다 고시에 청춘을 건 학생들이 적지 않다. 청년 실업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고시 열풍이 분다. 이것이 건전한 사회현상일까.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고작 일개 자격증 시험에 수년을 투자하는 사회를 건강하다 할 수는 없으리라. 고시 열풍은 한국사회 특유의 병리 현상이다.
현재의 고시제도는 조선시대 과거(科擧)와 너무도 닮아 있다. 요즘 청년들이 고시에 목을 걸 듯이 조선시대 식자층들도 그랬다. 한국사회에선 ‘사법시험 합격=신분의 수직상승’으로 통한다. 조선시대 때도 이러한 등식이 성립됐다. 그러다 보니 과거제도 자체가 타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조선시대는 양반관료 사회다. 말하자면 ‘관료’가 그 사회의 주체요, 지배자란 뜻이다.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이야 돈이 으뜸의 가치가 되었지만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는 입신양명, 즉 고급관료가 되는 것이었다.
관직에 대한 조선인의 열망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서 사랑을 성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관료가 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수많은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높은 벼슬에 올라서 이름을 떨치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도 이도령이 임금의 신임을 받는 암행어사가 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 아니던가.
관료의 등용문
관료가 되려면 과거를 거쳐야 했다. 먼저 조선시대 과거에 대해 정리해 보자. 과거에는 문과(文科) 무과(武科) 잡과(雜科)가 있다. 문과는 학문의 깊이가 시험대상이고 무과는 무예가 주 시험대상이다. 잡과는 역관(譯官) 의관(醫官) 등 기술관료를 뽑는 시험이다. 잡과는 일반적으로 중인들만 응시하는 것이어서 문과, 무과에 비해 격이 낮았다.
문과와 무과 중에선 문과가 훨씬 중요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라 하면 주로 문과를 가리켰다. 문과는 다시 소과(小科)와 대과(大科)로 분류됐다. 소과는 생원과 진사를 선발하는 시험이고, 대과는 국가의 정식 관료 33명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과거라 함은 바로 이 문과의 대과를 지칭했다.
현재 과거와 비슷한 시험인 행정고시는 1년에 한 번 시행된다. 하지만 과거는 달랐다.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식년시(式年試)가 정기 시험이었다. 1년에 11명의 합격자만 나오는 셈이니 당시 인구 수를 감안하더라도 합격의 문은 무척이나 좁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식년시 이외에도 무수한 비정기적 과거가 시행됐다. 바로 이 비정기적 과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식년시 이외의 문과 과거로는 증광문과(增廣文科) 별시문과(別試文科) 외방별시(外方別試) 알성문과(謁聖文科) 정시문과(庭試文科) 춘당대시문과(春塘臺試文科) 등이 있다. 성균관 유생에 한정해 치르는 인일제(人日製) 삼일제(三日製) 칠석제(七夕製) 구일제(九日製)도 있었다. 이 외에도 황감제(黃柑製)니 도기과(到記科)니 하는 별도의 비정기적 과거가 있었다. 이처럼 과거의 종류와 절차, 시험방식은 복잡했다.
과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였으므로 그나마 중세사회에서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다. 과거를 실시한 사회는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권력과 사회적 특권을 세습받았던 귀족사회에 비해 진일보한 사회였음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골품제를 유지했던 신라에 비해 과거제를 도입했던 고려가 좀더 진보한 사회인 것은 물론이다.
시험지 바꾸기, 합격자 바꿔치기
그러나 실제로 과거는 공정했을까. 답은 ‘예’가 결코 아니다. 과거는 시행 과정에 이미 커다란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불공정성이야말로 중세 조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요약한 것이었다. 제도상 천민(賤民)을 제외하면 과거 응시에 아무런 신분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를 준비하는 비용과 교육 기회는 사실상 양반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인구의 대다수인 농민-상민은 과거에 응시할 현실적 여건을 갖지 못했다. 상민에게 과거는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래서 과거는 참여자가 양반으로 제한된 양반사회 내부의 게임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게임마저도 공정하지 않았다. ‘부정 시험’이 존재했던 것이다. 과거에 관한 저서나 문헌을 뒤지면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 방법이 동원됐음이 확인된다. 예상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 가는 것, 시험지를 바꾸는 것, 채점자와 짜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것, 합격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것 등등 이루 다 꼽을 수가 없다. 첨단기술(?)도 동원됐다.
숙종 때의 일이다. 성균관 앞 반촌(泮村)의 한 아낙이 나물을 캐다가 노끈이 땅에 묻힌 것을 발견하고 잡아 당겼다. 대나무 통이 묻혀 있었다. 대나무 통은 땅속을 통해 과거시험이 열리는 성균관 반수당(泮水堂)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부정행위자는 대나무 통을 매설하고, 통 속에 노끈을 넣은 것이다. 과장(科場)에서 시험문제를 노끈에 매달아 보내면, 밖에 있는 자가 줄을 당겨 시험문제를 확보한다.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해 노끈에 묶어 보내는 수법이었다. 당국이 조사를 했으나, 범인은 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숙종실록 31년 2월18일).
이처럼 과거는 결코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응시자가 책을 베끼거나, 출제자가 채점자와 공모하거나, 서리(書吏)를 매수하는 일회성 범죄가 횡행했다. 또한 특정 정파가 자파 세력이나 친인척의 답안지에 의도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어 합격시키는 권력구조적 비리도 있었다. 조선 500년을 통틀어 부정의 흔적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시험이 범죄라는 의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정이 관례가 되고 풍속이 되어 버린 것이다. 예컨대 과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사항이었다. 그러나 만약 책을 가지고 과장에 들어가는 것이 일상화했다면 감독관은 어떻게 할 터인가. 현재 사법고시를 치를 때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정이 범죄의식 없이 일상화되면 그 제도는 그 날로 끝이며, 그 제도 위에 구축된 체제의 정당성은 사라진다. 이제 과거제도의 부정이 일상화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 때 1회에 무려 11만명 응시
과거를 치르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 점에서 ‘한양가(漢陽歌)’에서 묘사하고 있는 19세기 중엽의 과거시험 장면은 흥미로운 것이다. 워낙 긴 것이기에 중요한 장면만 인용한다.
“춘당대(春塘臺) 높은 언덕 영화당(暎花堂) 넓은 뜰에 배설방(排設房) 군사들과 어군막(御軍幕) 방직(房直)이가 삼층 보계판(補階板)을 광대하게 널리 무고 십칠량(十七樑) 어차일(御遮日)을 반공에 높이 치고…”
과거를 치르는 장소는 창경궁(昌慶宮)인 듯하다. 창경궁의 춘당대 영화당 넓은 뜰에 어좌(御座)를 설치했다. 임금이 친림하는 과거였다. 임금이 친림하는 과거는 알성시, 정시, 춘당대시 등이었으니, 아마도 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제 과장 입장을 기다리는 과거의 주인공인 과유(科儒)들의 모습을 보자.
“선비의 거동 보소, 반물 들인 모시 청포(靑袍) 검은 띠 눌러 띠고, 유건(儒巾)에 붓주머니 적서(積書) 복중(腹中) 하였으니, 수면(粹面) 앙배(央背) 하는구나. 기상이 청수(淸秀)하고 모양이 조촐하다.”
반물은 검은 빛을 띤 짙은 남색이다. 이 색을 들인 모시 청포를 입고, 검은 띠에 유건을 썼다. 글 읽고 몸 닦은, 단정한 선비 차림이다. 그러기에 기상은 청수하고 모양은 조촐하다지 않는가.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은 청수하고 조촐한 선비의 상과는 전혀 딴판이다.
“집춘문(集春門) 월근문(月覲門)과 통화문(通化門) 홍화문(弘化門)에 부문(赴門)을 하는구나. 건장한 선접군(先接軍)이 자른 도포 젖혀 매고 우산에 공석(空石) 쓰고 말뚝이며 말장이며 대로 만든 등(燈)을 들고 각색 글자 표를 하여 등을 보고 모여 섰다. 밤중에 문을 여니 각색 등이 들어온다. 줄불이 펼쳤는 듯 새벽별이 흐르는 듯 기세는 백전(白戰)일세, 빠르기도 살 같도다.”
‘부문(赴門)’은 문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즉 과장으로 입장하는 것이 부문이다. 입장하는 문은 넷이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이고, 나머지 집춘문, 월근문, 통화문은 창경궁 담장에 있는 작은 문이다. 이 네 문으로 거자(擧子)들이 입장한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서면 항시 긴장되어 조용한 법인데 법석대는 분위기라고 한다. 또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장에 입장하는데 그 모습이 야단스럽다고 한다. 또 ‘건장한 선접군’이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과장은 지금의 시험장과는 달리 번호가 매겨진 자기 좌석이 없었다. 과장에 들어서면 무조건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좋은 자리란 시험문제를 빨리 볼 수 있는 곳, 시험 문제를 빨리 낼 수 있는 곳이 으뜸이다. 어쨌건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입장해야 해야 하는데, 이때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진다. 부문에는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는 입장(入場)’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몸싸움을 전문적으로 떠맡은 건장한 사람들이 바로 선접군이다. 선접군은 자른 도포를 젖혀 매어 옷매무새를 단단히 하고, 우산과 말뚝 막대기(말장) 등 이상한 도구들을 들고, 자기 접(팀)이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등을 밝히고 문 앞에 선다. 밤새 기다린 끝에 문이 열린다. 등불은 줄불 흐르듯 새벽별이 흐르듯 화살처럼 쏟아져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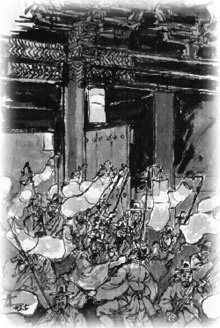
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며 기다렸던가. 자리 경쟁은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응시자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과거 응시자는 늘어났다. 정조 24년 3월21일 경과의 정시(庭試) 초시(初試)에 응시한 사람은 11만1838명이었고, 받아들인 시험지는 3만8614장이었다. 이튿날인 3월22일 인일제에는 응시자가 10만3579명이었고, 받아들인 시권은 3만2884장이었다(정조실록). 이틀에 걸쳐 21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한양 성내에서 시험을 쳤던 것이다. 영조 15년의 알성시에 응시한 사람은 1만7000~1만8000명이었으니, 영조 15년에서 정조 24년까지 61년 동안 과거 응시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당시 한양의 성곽 안의 인구는 20만에서 30만 사이였다. 서울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거를 치렀던 것이다. 지금 서울 인구를 1000만으로 잡고, 5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행정고시, 사법시험을 치러 서울에 들어오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울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 것이다. 이런 판이니 과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는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었다.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 폭력 난무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과거 공부를 한 순수한 수험생이었을까? 우하영(禹夏永)은 ‘천일록(千一錄)’에서 이렇게 말한다. “과거철이 되면 한양과 시골의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잡된 무리들이 ‘관광(觀光)’이라 핑계를 대고 세력가의 수종(隨從)이 되기를 자원해 부문(赴門) 쟁접(爭接)을 자기를 내세우는 노고와 공로로 삼는다”(‘용인’, 천인록).
이들이 바로 선접군이다. 어중이떠중이들이 세력가의 수종이 되어 과장에서 부문과 쟁접을 떠맡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래 목적이 과거를 치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속셈은 시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쟁접(爭接)이란 말이 나왔으니, 이것부터 먼저 언급하자. 다시 ‘한양가’다. “현제판(懸題板) 밑 설포장(設布場)에 말뚝 박고 우산 치고 후장 치고 등을 꽂고, 수종군(隨從軍)이 늘어서서 접(接)마다 지키면서 엄포가 사나울사 그 외에 약한 선비 장원봉(壯元峰) 기슭이며 궁장(宮墻) 밑 생강밭에 잠복 치고 앉았으니 등불이 조요(照耀)하니 사월 팔일 모양일다.”
과거 시험은 따로 문제를 인쇄한 종이를 나눠주지 않는다. 문제를 적은 현제판(懸題板)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적어와야 한다. 따라서 현제판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 것이 최고다. 현제판 근처에 도착하면, 자기의 접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자리를 깐다. 그리고 우산을 씌운다(왜 선접군이 말뚝과 말장, 우산을 지참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접이란 한 팀을 말하는 바, 과장에서 상부상조하는 한 팀이다. 접과 접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이것이 쟁접이다.
쟁접은 격렬한 몸싸움이었다. 다시 우하영의 말을 들어보자. “부문할 때는 짓밟는 폐단이 있고, 쟁접할 때는 치고 때리는 습관이 있다. 밟히면 죽게 되고 치면 다치게 된다.” 부문과 쟁접에서 주먹질 발길질이 마구 오간 듯하다. 자연 힘깨나 쓰는 자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세력가에게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듯하다. 이 자원한 선접군들은 부문과 쟁접에서 힘을 쓴 대가로 세력가의 도움을 받아 남의 글과 글씨를 빌려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한다. 고시관은 그것이 차작(借作)인지 차필(借筆)인지 모르므로, 이들이 간혹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할 일 없는 어중이떠중이가 권세가의 수종군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우하영은 “과장의 득실은 알 수 없다”(場中得失, 未可知也)는 당시 속담을 인용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과장은 실력보다 운이 통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다.
과장은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신성한 장소인 데도 폭력이 난무하고 사상(死傷)이 다반사인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시험을 치르는 곳에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 사실은 일면 충격적이다. ‘한양가’가 쓰여진 것은 19세기 중반이지만 이것이 비단 19세기만의 현상이었을까. 결코 아니다. 박제가의 ‘북학의’에 따르면 이미 18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하던 현상이었다.
응시자 중 답안지 제출자는 30%
박제가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는 그때보다 백 배가 넘은 유생(儒生)이 물과 불, 짐바리와 같은 물건을 시험장 안으로 들여오고, 힘센 무인(武人)들이 들어오며, 심부름하는 노비들이 들어오고, 술 파는 장사치까지 들어오니 과거 보는 뜰이 비좁지 않을 이치가 어디에 있으며, 마당이 뒤죽박죽 안 될 이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심한 경우에는 마치(무엇을 두드리거나 못 따위를 박는 데 쓰는 작은 연장)로 상대를 치고, 막대기로 상대를 찌르고 싸우며, 문에서 횡액을 당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며, 변소에서 구걸을 요구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루 안에 치르는 과거를 보고 나면 머리털이 허옇게 세고, 심지어는 남을 살상하는 일이나 압사(壓死)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온화하게 예를 표하며 겸손하여야 할 장소에서 강도질이나 전쟁터에서 할 짓거리를 행하고 있으므로 옛사람이라면 반드시 오늘날의 과장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안대회 역, 과거론, 북학의 155면).”
시험장에 거자뿐만 아니라 힘센 무인(아마도 선접군인 듯)과 심부름하는 노비들이 들어온다니 기강이 말이 아니다. 거기에다 술 파는 장사치까지 들어왔다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던 셈이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면 싸움이 벌어진다. 난투극이 벌어지고 마침내 사람이 압사하는 일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북학의’는 정조 때 쓴 것이다. ‘한양가’에서 풍속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 19세기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18세기에도 일반화된 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정조 때라면 역사에서 조선의 르네상스 운운하는 시기다. 이 르네상스에 이런 난장판이라니, 납득하기 어렵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한양가’에서 언급한 ‘자리잡기에 밀려난 장원봉 기슭과 궁장 밑 생강밭에 잠복 치고 앉은 약한 선비들’은 도대체 무엇하러 과거에 참여했던 것일까. 정조 24년의 시험에는 10만명 정도가 응시하여 3만명 정도가 답안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영조 때 화가인 장한종(張漢宗)의 ‘어수신화(禦睡新話)’란 책에 짧지만 과거의 모순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시골 선비가 식년(式年)에 과거길을 걱정하고 있었다. 종놈이 묻기를, ‘서방님, 무얼 그리 근심하셔유?’ 그러자 선비는 ‘간구한 양반이 또 과기(科期)를 당하니 어찌 근심이 안 되겠느냐?’라고 답했다. 그러자 종놈은 ‘매번 과거만 닥치면 서방님 행차합시느라 노마(奴馬)에 부비가 불소한 데 어려운 가세에 마련이 극난하구 말굽쇼. 금년 과장에는 쇤네가 대신 가기로 합지유. 명지(名紙)와 노비만 들 터이고 기타 부비야 크게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유?’라고 말했다. 선비는 ‘예끼 이놈, 네라서 양반이 하는 일을 한단 말이냐’하고 소리를 질렀다. 종놈은 ‘시지(試紙)를 다리 밑으로 던지는 일쯤이야 쇤네라고 못합니까유’라고 말했다.”(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일조각’, 233-234면.)
이 선비는 과거에 참여하여 답안지를 제출하기는커녕 늘 답안지를 다리 밑 하천으로 던져 종에게 비꼬임을 당했던 것이다.
양반체면 유지하려 실력 없어도 응시
조선 시대 때 과장에 출입하는 것은 양반 행세를 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지방의 유생이 서울에 올라와 과거시험을 한 번 치르는 데는 교통비, 숙식비 등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더구나 실력이 없어 답안지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체면’을 의식해 과거에 몰렸으니 과장이 터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응시생들은 한바탕 난투극을 치르고 나서 접을 모아 장막을 치고 자기 자리를 확보해 앉는다. 시험문제를 기다린다. 임금이 들어와 전좌하고 난 뒤 내시가 시험문제를 현제판에 내다 건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됐다. “관풍각(觀豊閣) 지나시고 관덕정(觀德亭) 지나셔서 보탑(寶榻)에 전좌(殿座)하사 군병(軍兵) 방위(方位) 정한 후에 어악(御樂)이 일어나며 모대(帽帶)한 환시(宦侍)네가 어제(御製)를 고이 들고 현제판(懸題板) 임하여서 홍마삭(紅麻索) 끈을 매어 일시에 올려 다니 만장중(滿場中) 선비들이 붓을 들고 달아난다.”
선비가 현제판에서 문제를 베껴 자기 접으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부정이 시작된다. “각각 제 접 찾아가서 책행담(冊行擔) 열어놓고 해제(解題)를 생각하여 풍우(風雨)같이 지어내니 글 하는 거벽(巨擘)들은 구구(句句)이 읊어내고 글씨 쓰는 사수(寫手)들은 시각을 못 머문다.”
‘책행담’이란 무엇인가. 행담은 싸리나 버들로 만든 작은 상자다. 말하자면, 요즘의 책가방과 같은 것이다. 이 가방 속에는 예상 답안지와 참고서적 등이 들어 있었다. 시험장에 책을 들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시험장에 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협서(挾書)’라고 한다. 협서는 조선시대 과거에서 이뤄졌던 커닝의 대표적 방법이었다. 예컨대 ‘성종실록’ 18년 2월23일에도 협서를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은 엄연한 범죄였다. 하지만 이수광(李?光, 1563-1628)의 ‘지봉유설’에 의하면 그의 시대에는 법이 해이해져 응시생들이 드러내놓고 책을 가지고 들어가 과장이 마치 책가게와 같았다고 한다. ‘지봉유설’은 광해군 6년(1614)에 탈고되었으니,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반에 이미 과장의 법이 극도로 문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자신의 시대에 협책 금지령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증언했다. 그는 “응시생들은 과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고 과장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글을 직접 짓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거벽(巨擘)’과 ‘사수(寫手)’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거벽은 과거 답안지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고, 사수는 글씨를 대신 써 주는 사람이다. 일종의 대리시험행위자인 셈이다. 거벽과 사수를 고용해 데려가면 자신은 전혀 작문을 할 필요도, 글씨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접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 거벽과 사수 등과 어울려 한 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접인 것이다(물론 거벽과 사수 없이 한 접이 되기도 한다).
‘청구야담(靑邱野談)’에 ‘편향유박생등과(騙鄕儒朴生登科)’라는 작품이 있다. “시골 유생을 속여 박생이 과거에 합격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박생은 영조조의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朴文秀)다. 박문수는 원래 문필이 짧은 터라 과거 합격은 생각지도 못하는 인물인데, 시골 유생을 속여서 과거에 합격한다는 내용이다. 이야기인즉 이렇다.
박문수는 초시(初試)에 우연히 합격한 뒤 회시(會試)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그는 먼저 한양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고장의 어떤 선비가 거벽이고 어느 고장의 어느 유생이 사수인가를 탐문하였다. 박문수는 이런저런 방도로 그들과 안면을 익혀 두었다. 시험날 거벽과 사수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응시생들과 함께 입장하였다. 박문수는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거벽에게는 글을 지어달라 하고, 사수에게는 글씨를 써달라 하여 그것으로 합격을 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물론 허구다. 하지만 거벽과 사수가 과장에 우글거리고 있었던 사정은 더할 수 없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거벽과 사수는 소설에 등장할 정도로 이미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돈을 받고 과문(科文)을 대신 지어 주었던 거벽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옥(李鈺)이 지은 ‘류광억전(柳光億傳)’의 주인공 류광억은 실제 과문을 팔았던 사람이다. 그는 합천 사람으로 과문에 능하여 이것으로 생계를 삼았다.
어느 날 한양에서 파견된 시관(試官), 곧 경시관(京試官)이 영남에 내려와서 감사에게 영남 제일의 인재를 묻는다. 류광억이라고 대답하자, 경시관은 자기의 감식안으로 수많은 답안지 중에서 류광억의 답안지를 골라내어 장원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경시관의 감식안을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 이내 시험이 치러졌고, 경시관이 한 답안지를 보니, 과연 으뜸이 될 만하였다. 그는 그 답안지를 류광억의 작품으로 여겨 1등에 뽑았다. 그런데 또 다른 작품을 보니 그럴 듯하여 2등, 3등으로 계속 뽑았다. 그러나 그 답안지에는 모두 류광억의 이름이 없었다. 조사해 보니, 류광억이 돈을 받고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되, 받은 돈의 다과(多寡)에 따라 답안지의 수준을 조절했던 것이다.
경시관은 글을 보는 자신의 안목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류광억의 이름이 없었기에 그를 잡아 자백을 받아 자신의 감식안이 정확했다는 증거로 삼고자 하였다. 경시관은 애당초 류광억을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류광억은 체포령이 떨어지자 잡히면 죽을 것이라면서 자살하고 만다. 이렇듯 류광억이 돈의 다과에 따라 답안지의 수준을 조절했다는 것은 거벽의 대리시험의 경지가 고도로 발달해 있었음을 증언한다.
거벽과 사수는 과거의 모순에서 탄생한 존재였다. 이들은 원래 과유(科儒)였고, 유능한 과문의 작성자였다. 그러나 재능만으로는 과거에 합격할 수 없어 결국 그들은 과문의 대필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었다.
거벽과 사수의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 “경각에 선장(先場) 들어 위장군(衛將軍) 외는구나. 한 장 들고 두 장 들어 차차로 들어간다. 백장이 넘어서는 일시에 들어오니 신기전(神機箭) 모양이요, 백설(白雪)이 분분하다. 수권수(收卷數) 몇 장인고 언덕 같고 뫼 같구나. 사알(司謁) 사약(司쿫) 무감(武監) 별감(別監) 정원사령(政院使令) 위장군이 열 장씩 작축(作軸)하여 전자관(塡字官) 전자(塡字)하고 주문(主文) 명관(命官) 시관(試官) 앞에 수없이 갖다 놓네. 차례로 꼲을 적에 비점(批點) 치고 관별(貫別)한다. 그 외의 낙고지(落考紙)는 짐짐이 져서 낸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제출한 답안지를 한데 묶어 채점을 하는 장면이다. 희한한 것은 답안지가 백 장을 넘어서부터는 신기전처럼 날아서 들어오는 것 같고 또 흰 눈이 내리는 듯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답안지를 빨리 내기 위해 응시생들이 일대 경쟁을 벌인 것이다. 왜 답안지를 빨리 내려고 했을까. 앞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인 것 역시 답안지를 빨리 내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답안지를 빨리 내는 것은 ‘조정(早呈)’이라 한다. 조선후기 과거 관련 자료들은 조정의 폐단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다. 모든 과거는 주관식이었다. 주관식 답안지는 다 읽어보기 전에는 평가할 수가 없으며 또 주관식이기에 채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그 많은 답안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점수를 매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한양가’는 당시 답안지의 양이 ‘언덕 같고 뫼(山) 같다’고 표현한다.
답안지 빨리 낸 사람이 합격률 높아
정조 24년 3월21일 경과의 정시(庭試) 초시(初試) 답안지는 3만8614장, 이튿날인 3월22일 인일제의 답안지는 3만2884장이었다. 이 과거는 국왕 친림의 시험이고 당일날 결과를 공포하는 즉일방방(卽日放榜)이었다. 하루만에 모든 답안지를 검토하고 합격자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판이니, 채점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답안지의 앞머리만 훑어보고 채점을 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일찍 제출한 답안지 중에서 주로 합격자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실제 정조 21년의 실록 자료에 의하면, 그 해 가을 감시(監試)의 이소(二所, 두 번째 시험 장소)에서 합격한 답안지는 최초로 낸 300장 안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하였다(정조실록, 21년 9월24일).
채점을 하는 시관(試官)은 일찍 낸 답안지만 보고 채점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답안지는 채점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일찍 제출한 답안지에서 합격자가 나오자, 응시생들은 답안지의 서두만 대충 써서 일찍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조정의 폐단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답안지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내도록 한다든가, 늦게 낸 답안지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든가 하는 오만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조정의 폐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같이 조선후기의 과거에선 부정이 풍습과 관례가 되었다. 범죄라는 의식도 없었다.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타락에 타락을 거듭했던 것이다. 이제 그 타락의 최후의 모습을 보자. 김구(金九) 선생의 ‘백범일지(白凡逸志)’에 조선시대 마지막 과거 풍경이 실려 있다.
백범은 정문재(鄭文在)라는 선생에게서 글을 배웠다. 정문재는 과유(科儒)로는 손꼽히는 사람이었다. 1892년 조선조 마지막 과거가 시행됐다. 백범은 아버지가 어렵사리 마련한 장지(壯紙) 다섯 장에 처음으로 답안지 글씨를 연습하고 정문재를 따라 해주(海州) 과장에 들어갔다. 과비(科費)가 없어 과거 보는 동안 먹을 좁쌀을 등에 지고 갔다니, 가세가 어지간히 어려웠던 모양이다.
백범이 전하는 과장의 모습은 이렇다. “관풍각(觀豊閣, 宣化堂 옆) 주위에는 새끼줄로 그물을 엮어 둘러치고, 열을 지어 이른바 부문(赴門)을 한다는 것인데, 선비들은 흰 베에 산동접(山洞接) 석담접(石潭接) 등 그 접의 이름을 써서 장대 끝에 매달았고, 저마다 종이 양산을 들고서 도포에 유건을 쓴 모양으로 제 접의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 용사들은 선도로 밀려들고 있었다. 이 대혼잡을 이루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과장에는 노소 귀천이 없이 무질서한 것이 유풍이라고 한다. 또 가관인 것은, 늙은 선비들이 구걸하는 일인데, 관풍각을 향해 새끼그물에 머리를 들이밀고 큰 소리로 외쳐대는 것이다. ‘소생은 성명이 아무개이옵는데, 먼 시골에 거생하면서 과시(科時)마다 내 참가하였던 바, 금년 나이 70도 훨씬 넘었사오니 다음에는 다시 참과(參科)하지 못하겠습니다. 초시라도 한번 급격이 되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고함을 질러대고, 또 어떤 이는 목놓아 울어대는 것이다. 그 모습은 비루해 보이기도 하고 가련해 보이기도 했다.”
백범 김구, 조선 마지막 과거시험 비판
‘한양가’보다 더 생생한 묘사다. 더 읽어보자. “우리 접에 와서 보니 선생과 접장들이 작자(作者)·작서자(作書者) 등을 쓰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늙은 선비들이 걸과하는 모양을 말하고 이렇게 청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말고 제 부친의 명의로 과지(科紙)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은 내 말에 감탄하시며 쾌히 승락했고 접장 한 분이 또 찬성해 주셨다. ‘그럴 일이다. 네 글씨가 나만은 못할 터이니 너의 부친의 명지는 내가 써 주마. 후일 네 과거는 더 공부하여 네가 짓고 쓰고 하여라.’ ‘네, 고맙습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다. 이 날은 아버님의 이름으로 과지를 작성하여 새끼그물 사이로 시관을 향해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고 있었다. 시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관에게는 뵈지도 않고 과지 한 아름을 도둑질해 간 놈들도 있었다. 또 과장에서 글을 짓고 쓸 때에는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유는 글을 잘 지을 줄 모르는 자가 남의 글을 보고 가서 자기의 글로 써서 들인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괴이한 말도 들었다. 돈만 많으면 과거도 할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부자들이 큰 선비의 글을 몇 백 냥, 몇 천 냥씩 주고 사서 진사도 하고 급제도 한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번 시관은 누구인가에서부터, 서울 아무 대신이 편지를 내려보냈으니 틀림없이 된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고, 시관의 수청기생에게 주단 몇 필을 선사했으니 이번에는 꼭 급제를 한다고 장담하는 자도 있었다.”(원본 백범일지 28~30면)
이것이 과거의 마지막 모습이다. 더할 수 없는 타락상이었다.
18세기경에 오면 과거는 이미 인재 선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은 ‘성호사설’의 ‘과천합일(科薦合一)’이란 글에서 “과거 시험은 장차 사람을 선발해 쓰려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서 쓰지 않는다면, 시험이란 게 도대체 무엇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성호의 계산에 의하면, 문과합격자가 갈 수 있는 벼슬자리는 실제 500자리에 불과하였다. 여기에 원래 3년마다 1번씩 열리는 정기 과거시험인 식년시에서 뽑는 사람은 문과 33명,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이었다. 합쳐서 233명이다. 따라서 30년 동안 모두 2330명을 뽑게 된다. 대개 한 사람이 입사(入仕)해서 치사(致仕)하기까지 30년이 걸리므로 30년을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자리는 500자리뿐이다. 관직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합격자 2330명에서 500명을 제한 1830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각종 비상설적 과거가 시행되고 있었으니 훨씬 더 많은 수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셈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엔 관료의 예비 후보군이 늘 넘쳐나는 상태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의 온갖 엽관운동, 관직매매는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당쟁 역시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이 성호의 견해다.
이런 상태였으니, 과거에 합격한들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합격자 내부에서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기득권자들은 당연히 후발 주자들을 배제하려 했다. 우리는 흔히 양반만이 과거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노비와 같은 천민을 제외하면 양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 여건상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다.
중인과 서얼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들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합격한다 해도 장래가 어두웠기 때문이었다. 중인과 서얼은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의 적용 대상이어서 벼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중인 서얼은 과거에 합격해 이름이 방목에 실리면, 이름 밑에 ‘중인(中人)’ ‘서(庶)’가 병기되었다. 내놓고 자신의 신분을 선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족집게 대리시험 전문가 양산
영조 연간의 시인 홍신유(洪愼猷)의 가문은 전형적인 중인가문이다. 그의 아버지 홍성귀(洪聖龜)는 역관 쪽으로 나가 당대에 꽤나 유명한 역관으로 활약했다. 홍신유의 대에선 전형적인 기술직 중인 가문이 됐다. 하지만 홍신유는 역관으로 활동하지 않고 영조 44년(1768)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합격했다. 영조대엔 역관 무역이 위축되어 역관 진출로가 좁아지자 중인들이 과거로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인 출신 홍신유가 과거에 합격한들 무슨 대단한 출세가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봉상시(奉常寺)·통례원(通禮院)의 말직과 찰방(察訪), 성균관 전적(典籍) 등 기술직 중인에게 허락되는 벼슬을 전전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중인이나 서얼은 과거에 합격한다 해도 세상에서 명예롭게 치고, 또 권력이 집중된 관직, 이른바 청현직(淸顯職, 또는 淸要職)에는 오를 수 없었다. 예컨대 임금의 자문역인 홍문관 벼슬, 비서역인 승정원 벼슬, 병조·이조의 벼슬, 사간원 사헌부 등의 벼슬, 그리고 이런 벼슬을 거쳐야만 하는 정승 판서는 이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였다.
대개 과거에 합격한 중인, 서얼, 그리고 문벌이 시원찮은 양반들은 먼저 분관(分館)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 이들은 대개 교서관 분관에 그쳤다. 분관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거치는 일종의 수습기간이다. 교서관(校書館) 성균관 승문원(承文院) 세 관청으로 분관이 되는데, 승문원 분관을 받지 않으면 출세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승문원 분관을 받아야 뒷날 정승 판서까지 바라볼 수 있고, 성균관 분관은 정승은 불가능하지만 사헌부 사간원 벼슬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서관 분관은 처음부터 미관말직으로 끝날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홍문관 벼슬을 거쳐야 하는 바, 이 홍문관 벼슬의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극히 까다로왔다. 문벌(門閥)이 없으면, 홍문관 벼슬의 후보자에도 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이중 삼중의 과정을 통해 기득권층은 문벌 있는 양반가의 이익을 유지한 것이다.
과거가 공정성을 잃는 과정은 벌열(閥閱)의 형성, 노론(老論) 일당 독재, 세도정권의 성립과 일치한다. 실제 과거를 아무리 자주 치러도 권력을 갖게 되는 핵심 지배층은 특정 소수 가문들이었다. 정약용은 과거가 남용되는 현상과 반비례하여 권세가에서는 과거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제는 과거학도 쇠진했다. 그래서 명문거족의 자제들은 이를 공부하려 하지 않고, 오직 저 시골구석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이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문예를 겨루는 날에는 권세가의 자제들이 시정의 노예들을 불러모아 이들에게 접건(摺巾)과 단유(短풘)를 입힌다. 그러면 이들은 눈을 부라리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자기 주인의 시험지를 먼저 올리기 위해 첨간(簽竿)만 바라보고 서로 앞을 다투어 몽둥이질을 한다. 급기야 합격자를 발표할 적에 보면 ‘시(豕)’와 ‘해(亥)’ 자도 분별하지 못하는 젖내나는 어린애가 장원을 차지하기 일쑤다. 이러니 이 과거학이 쇠잔하지 않을 수 없다”(국역다산시문집 124~125면).
장원을 차지하는 젖내나는 어린애는 물론 권세가의 아이다. 이미 영구불변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골머리를 썩혀 가며 과거공부에 전념하겠는가.
다산은 ‘하일대주(夏日對酒)’란 시에서 소수 권세가의 권력독점에 대해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위세도 당당한 수십가(數十家)에서 /대대로 국록을 먹어치우더니 /그들끼리 붕당이 나뉘어져서 /엎치락뒤치락 죽이고 물고 뜯어 /약한 놈 몸뚱인 강한 놈 밥이라 /대여섯 호문(豪門)이 살아남아서 /이들만이 경상(卿相) 되고 /이들만이 악목(岳牧) 되고 /이들만이 후설(喉舌) 되고 /이들만이 이목(耳目) 되고 /이들만이 백관(百官) 되고/ 이들만이 옥사(獄事)를 감독하네”(다산시선 250~262면).
조선후기 지배층은 과거의 타락상을 몰랐을까?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과거를 개혁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가 쏟아졌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개혁에 대해 이구동성 언급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갑오경장으로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폐단은 고쳐지지 않았다. 소수의 권력독점에 원인이 있었다.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의 중심에 드는 가문은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10개 가문, 넓게 잡아 20개 가문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권력은 과거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었다. 과거의 폐해가 바로잡히기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권력독점은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켰다. ‘하일대주’를 더 읽어보자. “가난한 촌민(村民)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빼어난 기품이 난곡(鸞鵠) 새 같아 그 아이 자라서 팔, 구세 되니 의지와 기상이 가을 대 같구나. 무릎 꿇고 아버지께 여쭙는 말이 ‘제가 이제 구경(九經) 읽어 천명(千名)에 으뜸가는 경술(經術)을 지녔으니 혹시라도 홍문록(弘文錄)에 오를 수 있나요.’ 그 애비 하는 말 ‘원래 낮은 족속이라 너에게 계옥(啓沃·임금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일)은 당치 않은 일.’”
미천한 시골 백성에게 빼어난 자식이 없으란 법은 없다. 이 똑똑한 자식은 자신이 학식이 이토록 풍부하니 임금의 자문역인 홍문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원한다. 하지만 아비는 말한다. “너는 지체가 낮아 그럴 수가 없다.” 아들은 방향을 바꾼다. 이제 무과를 염원한다. “‘제가 이제 오석궁(五石弓)을 당길 만하고 무예 익히기를 극곡(픜穀)같이 하였으니 바라건대 오영(五營)의 대장이 되어 말 앞에 대장 기(旗)를 꽂으렵니다.’ 그 애비 하는 말 ‘원래 낮은 족속이라 대장 수레 타는 건 꿈도 못 꿀 일.’”
무과로 출세하고자 하는 아들에게 아비는 꼭같이 답한다. 이제 아들은 지방 수령 등으로 기대를 낮춘다. “‘제가 이제 관리 일을 공부했으니 마땅히 군부(郡符)를 허리에 차고 종신토록 호의호식해 보렵니다.’ 그 애비 하는 말. ‘원래 낮은 족속이라 순리(循吏)도 혹리(酷吏)도 너에겐 상관없는 일.’”
자식은 절망한다.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울 수 없는 사회, 탈출구가 없는 사회에서 재능 있는 인간의 말로는 뻔하다. “이 말 듣고 그 아이 발끈 노하여 책이랑 활이랑 던져버리고 저포(樗蒲)놀이, 강패(江牌)놀이, 마조(馬弔)놀이, 축국(蹴鞠)놀이에 허랑하고 방탕해 재목되지 못하고 늙어선 촌구석에 묻혀버리네.” 결국 도박으로 자신을 망치게 된 것이다.
“때 되면 저절로 좋은 벼슬 생기는데…”
권력 독점구조는 권세가의 사람도 망치게 했다. 다음은 다산의 시다. “권세 있는 가문에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사납고 교만하기 기록(驥?)과 같아 그 아이 자라서 팔, 구세 되니 찬란하다,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 객(客)이 말하길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집은 하늘이 복 내린 집이라. 너의 관직 하늘이 정해 놓은 것. 청관(淸官) 요직(要職)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부질없이 힘들여 애쓸 것 없고 매일같이 글 읽는 일 할 필요 없네. 때가 되면 저절로 좋은 벼슬 생기는데 편지 한 장 쓸 줄 알면 그로 족하리.’”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이 이 말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다시는 서책을 보지도 않네. 마조놀이, 강패놀이, 장기두기, 쌍륙치기에 허랑하고 방탕하여 재목되지 못하건만 높은 벼슬 차례로 밟아 오르네. 일찍이 먹줄 한번 퉁기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큰 집 지을 재목이 될까보냐.”
과거(科擧)의 역사를 음미하면 현재가 보인다. 조선의 선비들이 골머리를 썩히며 공부했던 내용이 과연 유용한 것이었을까. 사실 과거에 쓰이는 공부는 실제 생활에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었다.
과거 시험 과목에는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이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작문 시험인 제술이었다. 제술의 과목은 시(詩), 부(賦), 송(頌), 책(策)등이었다. 시·부·송은 문학작품이고, 책은 논문이다. 주로 출제된 것은 시와 부였다. 현대적 시험개념과 가장 부합되는 과목은 책이었으나, 책이 출제되는 기회는 낮았다. 따라서 시와 부에 모든 응시자들이 목을 매었다. 하지만 과거의 시와 부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쓰지 못하는 것이었다. 시와 부의 작문을 공부하면 일반적인 시와 부의 작품창작에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과시(科詩)와 과부(科賦)는 일반 한시나 부(賦)와는 체제가 아주 달랐다.
박제가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치르는 과거에서는 과체(科體)의 기예(技藝)를 통하여 인재를 시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장이란 것이 위로는 조정의 관각(館閣)에 쓸 수도 없고, 임금의 자문에도 응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인간의 성정을 표현하는 데에도 불가능한 문체다. 어린아이 때부터 과거 문장을 공부하여 머리가 허옇게 된 때에 과거에 급제하면 그 날로 그 문장을 팽개쳐버린다. 한평생의 정기와 알맹이를 과거 문장 익히는 데 전부 소진하였으나 정작 국가에서는 그 재주를 쓸 곳이 없다”(북학의 152~153면).
갑오경장으로 과거제 폐지
과거에는 행정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사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 만약 행정고시나 사법시험에서 시를 쓰게 한다든가 수필, 문학비평을 문제로 출제한다면 그것은 코미디가 될 것이다. 박제가의 말대로 과거 공부란 과거 합격 이후 행정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이었다. 그저 서리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양반들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식분자들은 오로지 시험용 지식의 단련에 골몰하고 있었다.
정약용은 말한다.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은 무식하다. 경서와 사책을 공부해 정사(政事)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천 명이나 백 명 중 한 사람뿐이다. 그런데 사정은 어떤가. ‘지금 천하의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이들을 모아 일률적으로 과거라고 하는 격식에 집어넣고는 본인의 개성은 아랑곳없이 마구 짓이기고 있으니,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다산시문집 124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에 목을 매고 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치르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지겨운 조선시대여!
특히 조선시대엔 많은 여성이 기생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생제도는 양반 남성이 피지배 계층 여성을 마음대로 취하는 통로였다.

어우동이란 여인이 있다. 잘 알려진 사람이다(‘왕조실록’에는 ‘어을우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어우동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다. 조선시대 최대의 성적 스캔들을 일으킨 여인으로, 이 여인의 거침없는 남성편력, 성적 욕망의 표출은 자못 현대인의 관심을 끌었다. 어우동을 테마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든 작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성적 억압이 강고했던 중세사회에서 한 여인이 성적 자유를 구가했다면 근대화의 단초가 되는 행동이 아닌가’라고. 이건 그럴 법한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우동을 돌출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뒤집어보면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없다면 어우동 역시 없다. 조선시대 지배층인 양반들은 성리학이란 도덕철학으로 무장한 도덕적인 인간으로 알려져 있다. 어우동의 존재는 양반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에 오류가 있음을 암시한다.
조선시대는 축첩제가 공인되었으나 여성의 투기는 칠거지악으로 금기시되었다. 축첩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가 하면 기생제도도 존재했다. 조선시대 남성에게 성적 스캔들은 제도화,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축첩제는 커녕 남편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철저하게 응징되었다. 불균형이었다.
어우동에 앞서 어우동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유감동(兪甘同)이다. 이 인물의 일화도 1988년 ‘깜동’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된 바 있다. 유감동은 세종 때의 실존인물이다. 감동의 아버지는 검한성(檢漢城·일종의 벼슬 이름) 유귀수(兪龜壽), 남편은 평강현감 최중기(崔仲基)였다. 말하자면 감동은 당당한 사족(士族), 즉 양반이었다. 만약 양반이 아니었다면, 감동의 남성편력은 사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이 처음 보고된 세종 9년 8월17일의 ‘실록’ 자료에 의하면, 남편 최중기는 무안군수로 부임할 때 감동을 데리고 갔다. 그러나 감동이 병을 핑계로 도로 서울로 올라와 방종하게 굴자 최중기가 버렸다고 한다. 여기서 방종이라 함은 아마도 성적 방종을 의미할 것이다. ‘실록’은 감동의 사건을 처음 보고하면서, 그가 관계했던 남자로 이승(李升)·황치신(黃致身)·전수생(田穗生)·김여달(金如達)·이돈(李敦) 등 6명의 이름을 밝혔다. 그 외 이름을 숨긴 간통자 역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세종 9년 9월16일 최종 종결될 때까지 거의 두 달을 끌었다. ‘실록’ 자료를 정리하여 간통자의 이름을 모아보면, 거의 40명에 가깝다. 그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양반들이다. 총제 정효문(鄭孝文), 상호군 이효량(李孝良), 해주 판관(海州判官) 오안로(吳安老), 전 도사(都事) 이곡(李谷) 등이 제법 고관들이었고 장연 첨절제사(長淵 僉節制使)·사직(司直)·부사직·판관·찰방·현감 등의 벼슬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수공업 기술자인 공장(工匠)으로 수정장(水精匠)· 안자장(鞍子匠)·은장(銀匠)도 있었으니 감동은 신분에 상관없이 애정행각을 벌였던 듯하다.
간통한 여성은 사형, 상대남은 곤장형
이효량과 정효문은 양반답지 못한 처신을 했다. 이효량은 감동의 남편인 최중기의 매부이면서 감동과 간통했다. 정효문은 숙부 정탁(鄭擢)이 감동과 간통한 사실을 알면서도 감동과 성관계를 가졌으니, 근엄한 양반이 할 일은 아니었다. 물론 정효문은 정탁과 감동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사헌부의 조율(照律, 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정효문의 변명을 일축했다.
조선 정부는 남자 40명과 간통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감동에 대한 문책은 그가 결혼한 여인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 세종 9년 9월16일 사헌부는 감동의 형량을 결정했다. 감동에게 적용된 죄목은 간통이 아니라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자”에 해당하는 처벌이었다. 즉 “유감동이 최중기와 부부로 살 적에 김여달(金如達, 최초의 간통자)과 간통했던 바, 후에 남편과 함께 자다가 소변을 본다는 핑계로 달아나 김여달에게 갔다”는 것이 구체적 죄목이었고, 그 형량은 교형(絞刑), 즉 사형이었다. 이에 반해 감동과 간통한 남성 20명은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곤장 40대, 곤장 100대, 태형 50대, 파면 등 다양했으나 사형에 비하면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유감동 사건(1427)이 일어난 지 53년 뒤인 성종 11년에 너무나도 유명한 어우동 사건이 일어났다. 어우동의 이름은 성종 11년 7월9일 처음 나온다. 요지는 이렇다. 의금부가 “어우동이 태강수(泰江守)의 아내였을 때 방산수(方山守) 이란(李瀾)과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간통했는데 이는 율이 장(杖) 100대, 도(徒) 3년에 고신(告身, 조정에서 내리던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모조리 추탈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자, 성종은 “장형은 속전(贖錢)을 내게 하고, 고신을 빼앗은 뒤 먼 지방에 부처(付處)하라”고 명했다.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이어 같은 해 10월18일 어우동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 사이 어우동과 관계된 자료가 적지 않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은 어우동과 간통한 사람을 밝히고 처벌의 형량을 정함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런데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예컨대 방산수 이란이 어우동과 간통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어유소(魚有沼)·노공필·김세적·김칭·김휘·정숙지의 처벌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다.
사헌부에서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중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종과 일부 관료들은 방산수가 자기 죄를 가볍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끌어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어유소·노공필·김세적은 석방하여 신문하지 않았고, 김칭·정숙지 등은 한 차례 형신(刑訊)하고 석방했다.
성종의 처분은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끝내 이들에 대한 추가적 처벌은 없었다. 어유소는 병조와 이조의 판서, 좌찬성 등 최고위직을 지낸 중신이었다. 또 방산수와 수산수는 임금의 종친(宗親)이었다. 관직이 높을수록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것이다. 그 외 간통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가벼운 것이었고 심지어 2년 뒤엔 모두 풀려났다(성종 13년 8월8일).
상대 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토록 가벼웠던 데 반해 어우동에 대한 처벌은 앞서 밝힌 대로 극형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우동의 형량을 두고 조선정부 내에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당초 의금부에서 조율한 어우동의 죄목과 형량은 다음과 같았다.
“태강수 이동(李仝)이 버린 처 어을우동이 수산수 이기와 방산수 이란, 내금위 구전, 학유(學諭) 홍찬, 생원 이승언, 서리 오종련, 감의형, 생도 박강창, 양인(良人) 이근지, 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율이 결장(決杖)
100대에, 유(流) 2000리에 해당한다”(성종11년 9월2일).
성종이 직접 어우동 교수형 명령
의금부의 이같은 형량은 법전에 기초한 것이었다. 임금은 이 형량을 두고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 그 중 한 가지는 의금부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자는 것이었다. 정창손(鄭昌孫)의 말을 들어보자.
“어을우동은 종친의 처이며 사족의 딸로서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종과 세종 때에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하였으니,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조종(祖宗)의 전례에 따라 정해진 법률에 의해 단죄하자는 것이다. 범죄가 가증스럽다하여 율 밖의 형벌을 적용하면 자의적으로 율을 변경하는 실마리가 된다는 견해도 나왔다(김국광의 견해). 어우동의 죄는 무겁지만 율은 사형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다(채수의 견해).
최종적 결론을 내린 사람은 왕이었다. 성종은 법률 밖의 법률을 따르자는 심회(沈澮) 등의 주장을 따랐다. 성종은 음란 방종에도 불구하고 어우동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단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금부에 사율(私律), 곧 법률에 없는 율을 적용하라고 명하였다. 사형이 결정된 것이다.
무엇을 사형의 이유로 할 것인가. 10월18일 의금부에서 다시 어우동의 형량을 조정하여 왔다. ‘대명률’의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改嫁)한 것”에 비의(比擬)하여, “교부대시(絞不待時)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부대시는 중형이다. 교형에 처하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형에는 참형과 교형이 있는 바, 참형은 칼로 목을 베는 것이고 교형은 교살형이다. 원래 사형은 죽은 자의 원기가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을 해친다 하여 만물이 생장하는 봄, 여름을 피해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이 모질면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처형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이 교부대시, 참부대시다. 어우동의 교부대시에 대해 다시 의견 조율이 있어 의논이 분분했으나, 성종이 어우동을 죽이기로 결심한 터라 결론이 바뀔 리 없었다. 결국 의금부가 사형을 결정한 바로 그날(10월18일) 어우동의 목에 올가미가 걸렸다.
어우동이 한 일은 현재의 한국 법률에서도 간통, 즉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형은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당시 조선의 법률 조문, 현재의 검찰에 해당하는 의금부, 법률 전문가들인 상당수 정부 관료들도 사형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상대한 남성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본다면 더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우동은 죽임을 당했고 음녀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간통죄의 처벌에 임금이 이렇게 깊이 개입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어우동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풍성하지만, 대부분은 관련자들의 처벌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어우동의 남성 편력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다. 어우동의 행적은 어우동이 교형을 당한 그 날짜의 실록(성종 11년 10월18일)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어우동의 행각을 조금만 언급해보자.
어우동은 승문원 지사 박윤창(朴允昌)의 딸로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과 결혼했다. 태강수 이동은 임금의 종친이다. 어우동은 당당한 사족의 딸로 종친에게 시집을 갔으니, 지체가 높았다. 그러나 “시집가서 행실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태강수가 어우동을 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태강수가 은장(銀匠)을 불러 은그릇을 만드는데, 어우동이 은장이에 호감을 품고 계집종 옷을 입고 은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남편이 내쫓았던 것이다. 이것이 어우동이 쫓겨난 내막이지만 자세한 사연은 알 길이 없다. 남편에게서 쫓겨나 친정집에 머무르던 어우동을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은 계집종이었다. 계집종은 어우동에게 오종년이란 사람을 소개한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에 상심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오종년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의 도리(都吏)가 되었고, 용모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족계(族系)도 천하지 않으니, 배필을 삼을 만합니다. 주인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계집종은 오종년을 데리고 왔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이후의 ‘실록’은 어우동이 먼저 유혹하거나 혹은 유혹당하기도 하면서 오종년을 시작으로 방산수 이란, 수산수 이기, 전의감 생도 박강창·이근지, 내금위 구전, 생원 이승언, 학록 홍찬, 서리 감의향, 밀성군의 종 지거비 등과 관계를 맺은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조선사회는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은 나라였다.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다. 삼강오륜은 그 윤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윤리적이라는 사회에서 유감동과 어우동은 얼핏 돌출적인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감동과 어우동의 출현은 전혀 돌출적 현상이 아니었다. 세종 18년 4월20일 이석철(李錫哲)이 처제인 종비와 통간한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세종은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간통사건들을 떠올린다.
“변중량(卞仲良)의 누이동생, 가노(家奴)와 간통. 유은지(柳殷之)의 누이동생이 중과 비밀히 간통하고, 가노 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임. 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의 아내가 지신사 조서로(趙瑞老)와 간통. 승지 윤수(尹須)의 아내 조씨(趙氏)는 고종사촌 홍중강(洪仲康)과 장님 하경천(河景千)과 통간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함. 금음동(今音同)과 동자(童子)는 모두 양가의 딸로서 혹은 종형과 통간하고, 혹은 외인과 통간하여 풍속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결죄(決罪)하고 천인으로 내침. 유장(柳璋)의 딸인 안영(安永)의 아내는 고종사촌 홍양생(洪陽生)과 통간. 이춘생(李春生)의 딸인 별 시위 이진문(李振文)의 아내(어리가)는 부사정 이의산(李義山)과 양인 허파회(許波回)와 통간함.”
구름이 달을 가리자 기생을 더듬고…
이것들은 세종의 기억에 간직된 것이고 또 사건화된 것이니,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일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감동과 어우동은 결코 돌출적 존재가 아니었다. 조선사회는 간통이 다반사로 일어난 사회였다. 도덕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종 15년 어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록을 참고하자.
어리가는 병조참판 이춘생의 딸이고 별시위 이진문의 아내였다. 양반 중의 양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리가는 “양반집 부녀로서 상복(常服)을 입고 길거리를 쏘다니며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여 이의산과 비첩(碑妾) 소생인 허파회와 간통”했다(세종 15년 11월25일). 사건이 알려진 뒤 어리가는 해진(海珍)에, 이의산은 기장(機長)에 안치되었고, 허파회는 영북진(寧北鎭)에 충군(充軍)되었다(세종15년 12월5일).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헌부는 이런 말을 한다. “본조(本朝)에서는 사족의 집 부녀는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수레를 타게 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지하고 막는 것이 지극히 엄중한 것은 여염 부녀자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도덕적 금제(禁制)가 완강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간통사건이 자주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론은 자명하다. 이슬람의 율법 같은 조선의 도덕적 금제보다 성적 욕구를 분출하려는 남성들의 행동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다.
성관계란 남녀 둘이 있어야 가능하다. 여자끼리의 성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성적 소수자(小數者)의 일이다. 따라서 감동과 어우동 사건은 여성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남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우동을 성적 이상자라고 한다면(이것이 감동과 어우동을 치죄한 근거였다), 양반계층의 남성들이야말로 더 확실한 성적 이상자였다. 조선시대 왕들은 원하기만 하면 성적 상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다. 자식을 많이 보아 왕실을 튼튼히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여성이 임금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승은(承恩)’, 곧 은혜를 입은 것으로 표현됐고, 그들은 이내 후궁이 되었다. 제왕이 정비(定妃) 이외에 후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두고 간통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간통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의 권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다.
감동과 어우동을 비난하고 처벌했던 양반들의 성 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흔히 고려 말의 도덕적 타락상을 들지만, 조선 전기 양반들도 고려에 못지않았다. 성종 20년의 일이다. 왕은 의정부·육조 판서·경연 당상·승지·홍문관 예문관 등의 고급관료로 하여금 장악원에 모여 달 구경을 하게 하였다. 음력 8월15일 한가위의 밤이었다. 임금은 술과 음악을 하사했다.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런데 ‘실록’에는 사신의 평이 실려 있다.
“임금이 근신(近臣)을 우대하여, 은례(恩禮)가 심히 융성하였다. 이날 밤에 여러 신하가 회음(會飮)하였는데, 마침 검은 구름이 달을 가리어 어두컴컴하고 밝지 아니하니, 승지 조극치(曹克治)가 기생을 데리고 청사(廳事)에서 음행(淫行)하였다”(성종 20년 8월15일).
8월15일은 만월이지만, 마침 구름이 달을 가렸다. 야음을 이용하여 승지 조극치는 임금이 주최한 파티에서 기생과 성행위를 벌였던 것이다. 조극치는 사신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조극치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병사 동원해 대로에서 기생 쟁탈전
세종 16년 자료를 보자. 8월에 장마가 열흘 동안 계속돼 벼농사가 말이 아니었다. 당연히 금주령이 내려졌고 왕도 근신중이었다. 이런 때 이순몽(李順蒙)은 경상도 도절제사가 됐고 조종생(趙從生)은 전라도 관찰사로 발령이 났다. 이들은 행사직(行司直) 홍거안(洪居安) 집에 모여 기생과 광대를 불러 풍악을 잡고 술판을 벌였다. 가뭄에 잔치를 한 죄로 두 사람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부임하지도 못하고 벼슬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순몽에 관한 기록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이순몽은 영양군(永陽君) 이응(李膺)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이 동지총제에 이르렀고, 기해년 대마도 정벌 때에 전공(戰功)이 있어서 자헌(資憲)에 올랐으며, 지난해에 파저강 토벌에서도 노획한 바가 많아서 판중추(判中樞)에 올랐다. 위인이 광음(狂淫)하고 방탕하였는데, 한번은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다가 상주(尙州)의 기생을 데리고 문경현(聞慶縣) 초참(草岾)에 와서 기생과 같이 냇물에서 목욕을 한 뒤 나무 그늘 밑에 끌고 들어가서 크게 외치기를, ‘기생과 행음(行淫)한다’ 하고 곧 행음하였으니, 광탕(狂蕩)함이 이와 같았다”(세종 16년8월5일).
이순몽보다 더 단수가 높은 인물은 그의 아들 이석장(李石杖)이었다. 이석장은 아버지 이순몽의 첩 보금(寶今)과 통간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석장은 자기가 아버지보다 먼저 보금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했다(단종 즉위년 6월24일).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순몽이 황음(荒淫)하여 법도가 없어 가법(家法)이 패하고 무너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석장과 보금의 통간은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런데 정작 이석장이 죽은 것은 1년이 지난 뒤 옥중에서였다. 그는 보금을 옥중으로 계속 불러 측간(화장실)에 가서 간통하였는데, 그 여자가 또 아이를 배 일이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그 여자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한 아이의 분만을 마친 뒤 나머지 아이를 해산하던 중 죽었다.
조극치·이순몽·이석장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양반의 성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양반 사대부는 이념은 도덕적이었으나, 실제 생활에선 결코 도덕적이지 않았다. 현대 사회에서 터부시하는 일들도 양반들 사이에선 빈번히 발생했다. 축첩제와 매매춘이 일상화된 형태인 기생제도는 양반들의 일탈적 성생활을 가능하게 한 사회구조적 요인이었다.
태종 7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이해 12월2일 태종은 대호군 황상(黃象)을 파직시키고, 갑사(甲士) 양춘무(楊春茂) 등 네 사람을 수군(水軍)에 편입시켰다. 수군은 천역(賤役)이기 때문에 수군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했다. 기생 쟁탈전이 그 발단이 됐다.
황상은 기생 가희아(可喜兒)를 첩으로 삼았는데, 총제(摠制) 김우(金宇) 역시 가희아와 통정한 사이였다. 11월12일 동짓날 가희아가 궁중 잔치에 불려갔다가 잔치가 끝난 뒤 대궐을 나와 황상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우가 자기 휘하의 기병(騎兵) 보병(步兵) 30여 명을 보내 대기하고 있다가 가희아를 납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작전(?)이 실패하자, 김우의 병사들은 황상의 집을 포위했고 김우의 부하인 갑사 나원경·고효성 등이 곧장 황상의 내실(內室)에 들어가 가희아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가희아의 옷만 가지고 돌아갔다.
김우는 다음날에 다시 종들을 보내 이번엔 가희아를 납치하는 데 성공했다. 일행이 수진방 어구에 이르렀을 때 황상이 말을 달려 뒤쫓아왔다. 그러자 김우가 즉시 부하인 갑사 양춘무·고효성·박동수 등 10여 명과 개인 수행원 20여 명을 출동시켜 황상과 몽둥이 싸움을 벌이게 했다. 군대의 고급장교들이 기생을 차지하기 위해 휘하의 병사를 동원하여 백주대로에서 전투를 벌인 것이었다. 이것은 희대의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기생을 집에 데려와 함께 사는 일 일상화
가희아의 사건은 결코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기생 쟁탈전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성종 13년 1월4일 청풍군(淸風君) 이원이 전 부평부사 김칭과 길거리에서 기생 홍행(紅杏)을 두고 설전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김칭은 구속, 이원은 종부시에서 국문을 당했다. 그런데 처벌 이후에 벌어진 싸움이 더 흥미롭다.
12일 뒤 두 사람은 한 번 더 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칭은 홍행의 집에 가서 이원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이원의 왼손을 깨물어 상처를 냈던 것이다. 옆에 있던 홍행은 김칭이 다칠까봐 이원의 허리를 붙잡았는데 그 바람에 이원의 옷이 찢어졌다. 김칭은 장 100대의 중형을 받았다. 홍행은 장 90대를 맞았다.
홍행과 이원은 한 차례 전과가 있는 사이였다. 이원은 자신의 칠촌 숙부(七寸叔)인 송림 부정(松林副正) 이효창(李孝昌)의 첩기(妾妓)였던 홍행을 간통한 사건으로 3년 전에 파직된 적이 있었다(성종 10년 7월28일). 이원은 이 사건과 홍행의 집에 가서 김칭과 다툰 사건으로 직첩(職牒)을 박탈당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달 뒤 김칭은 홍행을 귀양지로 불러들여서 관계를 갖다가 발각되어 다시 처벌되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성종 20년 12월1일에 발생했다. 공조 정랑으로 임명된 이계명(李繼命)의 인사가 합당한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유는 이계명이 기녀를 두고 다른 남성과 다투다가 머리털이 잘린 적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계명은 이러한 구설 때문에 하마터면 벼슬을 얻지 못할 뻔했다. 기생 쟁탈전은 양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던 셈이다.
기생이 아닌 민간의 부녀를 겁탈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성종 13년 1월17일 사헌부 보고에 의하면,
안악군수 곽순종(郭順宗)은 신천(信川) 고을 수령과의 잔치에서 관비(官婢) 우동(于同)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우동의 남편을 잡아 가둔 뒤 우동을 밤새도록 범했다.
부모의 상중에 기생과 관계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성종 18년 11월10일 자료엔 김석이란 자가 나온다. 그는 어머니의 상중에 빈소를 차려놓은 상태에서 기생 백옥아(白玉兒)와 성관계를 가졌다. 세종 28년 12월12일 유연(柳淵)은 아버지 부지돈녕 유중창(柳仲昌)이 죽자,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 소진주(小眞珠)를 간통하고는 음악을 벌여놓고 술을 마시며 공공연히 고기를 먹었던 사건으로 국문을 받았다. 최말철(崔末哲)은 국상 중에 기생 천금월(千金月)·중아(中蛾)를 간통하여 과부인 어미 집에 데려다두고, 또 부친의 상중에 의녀(醫女) 월비(月非)를 간통한 사건으로 불충 불효의 죄목으로 귀양을 갔다가 벼슬이 떨어졌다(세조 3년 6월18일).
이런 류의 사건 중에서 압권은 군기시 주부 이청(李聽)의 경우일 것이다(세종 22년 10월30일). 이청은 무뢰배와 어울려다니는 힘깨나 쓰는 사내였다. 어머니가 병들자 병환을 시중하였으나, 병이 심해지자 시중은커녕 창기 패강아(貝江兒)에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게 하면서 술을 마시는 등 걱정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가 죽자, 패강아를 집에 숨겨두고 간음하였다.
사헌부에서 소문을 듣고 집을 수색하자 패강아가 나타나 “이청이 어떤 때에는 저를 종(奴)의 집에 숨기고, 어떤 때에는 빈소(殯所) 옆에 숨겼습니다”고 하였다. 이청의 아버지 이종인(李種仁)은 이때 의금부 지사(知事)였다. 아들의 부도덕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출근했다가 파직되었다. 이청은 전 판사(判事) 이반(李蟠)의 손자이고, 대제학 윤회(尹淮)의 사위였다. 이청과 그의 아내는 가까운 친척인데 이욕(利欲)을 탐내어 혼인했다고 한다. 사신의 평은 이렇다. “이반과 윤회는 다 유자(儒者)이나 이욕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국상 때는 원래 기생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말도 되지 않는 법이지만, 법이 있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실록에도 국상 중에 기생과 관계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무수히 보인다. 예컨대 성종 4년 8월27일 안철손(安哲孫)은 국상(國喪) 중에 감사(監司)로서 관기(官妓)를 마음대로 간통하여 홍주(洪州) 온 고을이 시끄러웠고, 충청도 온 도가 시끄러웠으며, 조정이 떠들썩하여 성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안철손의 처벌문제를 두고 한동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기생 쟁탈, 상중의 성행위, 간통, 부녀의 강간 등의 행위는 양반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된 일이었다. 기생 점유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황상과 김우의 가희아 쟁탈전이 문제가 된 것은 군사를 동원해 백주대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않았다면, 세상에 알려질 일도 아닌 사건일 뿐이었다. 이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말을 들어보자.
“내연(內宴)에 정재(呈才, 조선 때 대궐 잔치에서 하던 노래와 춤)하는 상기(上妓)를 간혹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妾)이라 하여 항상 내보내지 않는 일이 있다. 내가 일찍이 얼굴을 아는 기생도 내연에 혹 나오지 않는 자가 있어, 정재에 결원이 생긴다.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제 집에 숨겨두고 ‘제 첩이라’고까지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태종 7년 12월2일).
정재는 궁중의 잔치에서 춤과 노래 등 연예를 보이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생은 공노비(公奴婢) 신분이다. 개인이 점유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따라서 기생의 독점은 불법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궁중의 정재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임금이 한탄할 정도로 기생을 특정 양반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일이 유행했던 것이다. 며칠 뒤 태종은 사헌부 장령 탁신(卓愼)을 불러 명령하였다.
“이제 들으니, 상기의 연고로 말미암아 탄핵을 당한 자가 많다고 하는데, 전날 내가 말한 것은 여러 해 동안 제 집에 숨겨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 것이고, 조관(朝官)이 상기를 첩으로 삼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기생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반들의 기생 독점은 처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책이 필요했다.
세종 원년 평안도 감사 윤곤(尹坤)은 지방관들이 관기(官妓)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엄금할 것을 건의한다. 윤곤이 묘사한 양반 관료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음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대소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들고 외방에 나가면, 관기(官妓)와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고 욕심이 허락하는 한 즐긴다. 만약 기생과의 즐거움이 흡족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 수령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험 찾기로 없는 죄를 찾아내어 죄망(罪網)에 몰아넣는다. 지방 수령의 경우도 법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 사신이 성적 상납을 요구하면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서울서 귀한 사람이 오면 강제로 관기와 성관계를 갖게 하며, 순응하지 않는 관기는 무겁게 처벌한다. 더욱 비인간적인 것은 모녀와 자매를 모두 기생으로 만들고, 한 사람이 두루 성관계를 갖는 경우다. 명사들끼리나, 한 고을 안에서 서로 좋게 지낸다는 자들도 기생 하나를 놓고 다투어, 서로 틈이 벌어져 종신토록 다시는 좋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
지방관리들, 중앙관리들에게 성 상납
윤곤은 특수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화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곤이 관기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음악을 제공하는 관기 제도를 존속시키되, 사신이나 귀한 손님이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는 경우 주객(主客)을 모두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은 예조에 명하여, 의정부·육조와 상의하여 대책을 만들어 올리게 한다. 후일의 자료를 보건대, 대책은 일단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세종 20년 11월23일 사헌부는 기생을 첩으로 삼는 일을 일절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 기생 점유에 대한 제한책이 나왔던 것이다. 제안 이유를 들어보자.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관리로서 창가(娼家)에서 자는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관리의 자손으로서 창가에 자는 자도 죄가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국의 대소 관리는 기생으로 첩을 삼아서 음란하고 더럽고 절개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생 때문에 부부가 반목하고 부자 형제 사이가 벌어지고, 대대로 향화(香火)의 신의와 금석(金石)의 교제를 닦아오던 터이라도 서로 시기하고 몰래 중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탐오(貪汚)하여 장물을 범하는 자들은 대개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기생에 대한 탐닉은 거의 일반화된 일이었던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사신은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
“이때에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선비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생첩으로 집안 일을 관리하게 하여 적처(嫡妻)와 다름이 없는 자가 꽤 많이 있었으므로, 혹은 이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구타하여 상해(傷害)를 입히기도 하여,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선비의 풍속이 불미하였던 까닭으로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었다.”
기생을 점유하여 첩으로 만드는 풍조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세종28년 5월23일 사헌부 보고에 의하면, 국상(國喪) 중에 어떤 벼슬아치가 기생 만환래(萬喚來)의 집에 들어갔다가 본부(本夫)에게 쫓기어 상복(喪服)까지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종은 “관리가 창기(唱妓)의 집에서 자는 것은 실로 더러운 행동이나, 사풍(士風)이 이를 보통으로 안다”고 개탄하고 있으니, 저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세종 28년 1월30일에 다시 기생 점유문제가 불거졌다. 사헌부는 조관(朝官)으로 출사하는 사람이 창기와 관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우의정 하연(河演)은 “대소 사신(使臣)과 수령들은 음욕(淫欲)을 마음대로 행하여 폐를 끼침이 매우 많았다”고 말한다. 하연 역시 사헌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청했지만, 실록은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생은 ‘공공재’…법적으론 개인소유 금지
성종 17년 10월27일에 왕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린다. “국가에서 경외(京外)에 창기소(娼妓所)를 둔 것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연향(宴享)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듣건대 우후(虞候)·수령 및 대소 사신들이 사사로이 데려가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州)·부(府)의 기생들이 이 때문에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하니, 경은 엄하게 조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런 명령은 그때뿐이고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성종은 1년 뒤 다시 “창기(娼妓)는 본래 노래와 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조관(朝官)이 한번 지나면서 좋아하여 공가(公家)의 물건을 자기의 사유물로 삼았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이같은 무리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모두 추고(推考)하라”고 하고 있으니, 1년 전 명령은 완전히 빈말이 됐음을 알 수 있다.
관료들이 기생을 독점하는 방법은 이렇다. 사대부가 일단 마음에 드는 기녀를 발견하면 관리에게 부탁해 속신(贖身)해서 자신의 집에 데려온다. 그 대신 자기 집 여종의 이름을 기생 명부에 올린 뒤 죽은 것으로 서류를 꾸민 다음 그 여종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다.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보아도,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된다.
기생이라면 황진이 같은 미인을 연상하지만 이는 현대인의 중세에 대한 낭만적 상상력의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기생은 평범한 여인들로 사대부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어무적(魚無跡)이 연산군에게 올린 상소다(연산 7년 7월28일).
“지금 서울 기녀(妓女)와 시골 기녀가 있는데, ‘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이것은 군인들 가운데 아내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군인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까. 가령 군사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도 여자가 군중에 있는 것은 병법에서 꺼리는 일이며, 더구나 선왕(先王)의 정치에 군사를 위하여 창기(娼妓)를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이 보는 바로 말하오면, 사대부들의 잔치 때에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무적이야말로 기생 제도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사대부들의 연회 때 노래하고 춤추는 도구가 바로 기생이다. 그는 더 나아가 “창기(娼妓)는 미도(媚道)로써 사람을 홀리기를 여우처럼 하기 때문에 비록 행검이 높고 지조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음부(陰部)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성적 대상임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토지의 넓이와 둘레가 수천 리에 불과한 조선에서, 주(州)와 군(郡)에 수천 명이나 되는 창기”를 없애지 않았을까. 어무적은 여악의 폐단이 불교와 도교보다 10배나 더한데도, 대간(臺諫)·재상·시종(侍從)의 신하들 중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산군은 이에 대해 답이 없었다. 그 역시 향락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비 출신 여성은 대부분 제도적으로 기생이 되고, 지배계층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었다. 사대부들은 그들을 차지하는 데 골몰했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성적 향락을 맹렬히 추구한 존재들이었다. 감동과 어우동은 이런 분위기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한 인물이었다.
조선사회의 양반은 성에 관한 한 겉과 속이 달랐으며 도덕적으로도 유죄였다. 그럼에도 악명은 여성들이 뒤집어썼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도 여성들이다. 남성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구제되었다. 감동과 간통했던 이효량의 경우만 보아도 양반 출신 감동은 노비가 되었지만, 효량은 고위관직에 다시 올랐다. 실제 감동과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대다수 간부(姦夫)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은 뒤 사면되었다. 공신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거나 곤장 몇십 대를 맞고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감동, 어우동의 변명은 들을 길이 없다. 역사는 그들의 변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남성이 언어를 장악하고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의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권력이 진실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한다. 유감동 사건에 관련된 기록 하나를 읽어보자. 유감동에 대해 지사간원사 김학지(金學知) 등은 상소문에서 김여달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감동 여인의 추악함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김여달에게 강포(强暴)한 짓을 당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부녀들 중에 강포한 자에게 몸을 더럽힌 사람이 간간이 있었지만 모두 시정과 민간의 미천한 무리뿐이었는데, 지금 김여달은 어두운 밤에 무뢰배와 작당하여 거리와 마을을 휩쓸고 다니다가, 유감동 여인을 만나 그가 조사(朝士)의 아내인 줄을 알면서도 순찰을 핑계하고는 위협과 공갈을 가하여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희롱했으니, 이것을 보더라도 유감동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으며 김여달이 강제로 포악한 짓을 행한 것이 명백하니, 어찌 미천한 무리들이 간통한 것처럼 가볍게 논죄할 수 있겠습니까”(세종 9년 9월29일).
모든 것은 김여달의 강간행위로부터 시작됐다. 유감동이 김여달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후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김여달은 감동의 남편 최중기가 있는 집까지 드나들면서 계속 성폭행을 하고, 마침내는 유감동을 데리고 도망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유감동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고, 이후의 행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역사는 유감동의 이러한 복잡하고 처절한 심리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어우동의 경우는 어떤가? 어우동이 교형을 당하던 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성종 11년 10월18일).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었을 것이라 의심하였는데, 그 어미가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이라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어우동의 어미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성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강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약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어우동은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죽음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女子)들이 음행(淫行)을 많이 자행한다. 만약에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懲戒)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어을우동이 음행을 자행한 것이 이와 같은데, 중전(重典)에 처하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성종 11년 10월18일).
성종은 어우동을 사형에 처한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풍속이 아름답지 않아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는 판단에는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성은 쌍방적 행위다. 남성들이 도덕적 행위만 하는데 여성들이 음행을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성에 탐닉한 쪽은 지배계층 남성들이었고, 이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 결과 여성들의 음행이 늘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물어 단죄를 했으니 이러한 판단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극단적 ‘남성 양반’ 중심체제였다. 남성중심주의는 일부일처제를 넘어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킬 수단을 제도화했다. 즉 축첩제와 기녀제는 남성의 성욕을 무한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다. 여성의 음행을 비판하면서도 양반관료들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축첩했고, 기녀를 점유하고자 하였다. 어우동을 사형시킨 성종은 왕비 3명(폐비 윤씨 포함), 후궁 10명을 두고 있었다. 후궁은 본질적으로 왕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였다.
양반들의 축첩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축첩제도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축첩제도에서 ‘서얼(庶孼)’이 태어났고, 이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얼차대’ 현상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조선조가 끝날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감동과 어우동을 낳은 것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었으나, 감동과 어우동은 다시 남성에 의해 단죄되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성종에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성적 향락을 왕에게로 독점시켰다. 성종대의 궁중과 사대부들은 소비와 향락에 들떠 있었다. 연산군의 방종은 퇴폐적 향락분위기의 연장이었으나 연산군은 그러한 향락을 독점하려 하였기에 사대부들에 의해 축출되었던 것이다.
조광조의 퇴폐문화 개혁도 실패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조광조(趙光祖)가 이끄는 기묘사림이 등장하여 도덕주의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러한 지배층의 퇴폐문화를 단속하려 했다. 예컨대 조광조 세력은 기생제도를 폐지시켰다. 하지만 훈구세력의 반발로 기묘사림이 축출되면서 가장 먼저 부활한 것이 바로 기생제도였다. 선조 때부터 기묘사림의 후예인 사림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일은 성적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 시기부터 왕조실록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내(이언인)가 일찍이 허벅지에 종기가 나서 누워 있는데, 구씨가 와서 아픈 곳을 묻고 인하여 종기를 문지르면서 음욕(淫慾)의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또 와서 종기를 만지다가 드디어 음근(陰根)에 미치기에 내가 발로 찼습니다. 그 뒤 내 병이 나은 어느 날 어두운 밤중에 구씨가 나를 불러 밀과(蜜果)를 주어 먹게 하고 인하여 침방(寢房)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어우동이 되어 죽더라도 정욕을 참을 수 없다’고 하므로 드디어 간음하였고, 그 뒤에는 매양 틈을 타서 간음하였습니다. 하루는 구씨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오랫동안 월경이 없으니, 아마도 임신한 것 같다’ 하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곧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성종 17년 1월22일. 덕성군(德城君)의 처 구씨가 조카 이인언(李仁彦)과 간통한 내막을 보고한 내용의 일부).
중종 이후엔 성에 관련된 사건들이 실록에서 없어졌다. 그러나 축첩제와 기생제도는 중종 이후에도 계속됐고, 조광조와 같은 개혁 세력들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했으며 조선 중·후기 세도정치의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퇴폐행위가 만연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중종 이후 성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지배계층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발생건수가 현격히 줄었기 때문에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현상은 그대로인데 현상 자체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 중·후기는 성 담론을 추방함으로써 ‘양반의 성’에 더욱 위선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듯하다.
'문화&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정일의 역사와 사람들 (0) | 2009.10.03 |
|---|---|
| 김두규 교수의 "우리 문화 우리 풍수" (0) | 2009.10.03 |
| 조선의 비주류 인생_05 (0) | 2009.09.30 |
| 자객 고영근의 명성황후 복수기 (0) | 2009.09.23 |
| 이상남의 奇人野史 (0) | 2009.09.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