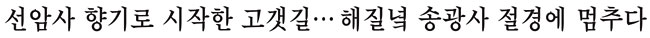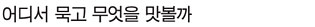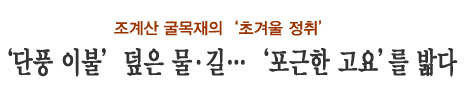 |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의 선암사와 송광사. 어디가 더 낫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한 위세에다 그윽한 정취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맑은 절집. 다시 설명하기 새삼스러울 정도로 익히 알려진 곳이지요. 선암사에서 송광사로, 혹은 송광사에서 선암사로 절집을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계산을 넘어 두 절집을 잇는 실낱같은 고갯길 ‘굴목재’입니다. 고갯길의 거리는 6.5㎞. 두 절집으로 드는 들머리까지 다 합친다면 8.4㎞ 남짓입니다. 단풍 따라 밀려왔던 행락객들의 어지러운 발걸음이 낙엽으로 지워지고 있는 절집은 고즈넉했습니다. 절집의 들머리에서 잘 마른 장작을 때는 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절집에 딸린 작은 찻집에서 일찍 오는 손님들을 위해 대추차를 달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순백의 차꽃이 피어난 절집을 지나고, 가지런히 도열한 편백나무도 지나서 흰 입김을 뿜으며 걸어 들어가는 숲길. 마지막 단풍을 아슬아슬 매달고서 시리게 선 나무들에게서는 알싸한 박하향이 풍겼습니다. 모든 숲이 바야흐로 ‘다 내려놓는 시간’을 맞아 고요로 출렁이는 시간. 이 길이야말로 그런 시간의 즈음에 딱 맞는 길입니다. 두 절집을 잇는 산길에서 줄곧 따라오는 건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위의 발자국 소리뿐. 가는 물소리와 나무를 지나가는 바람소리, 간혹 새소리가 발자국 소리 위에 겹쳐지기도 했습니다. 배낭 따위는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빈손으로 걷는 게 더 나은 길. 이 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혹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수행의 맑은 기운이 몸 안에 가득 차 넘칩니다. 길 이쪽저쪽에서 마치 길을 묶어놓은 매듭처럼 자리 잡고 있는 두 곳 절집의 고요한 초겨울의 정취 또한 빼놓을 수 없지요. 이맘때 순천으로의 여정을 권하는 이유가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낙안읍성에서는 처마를 잇대고 있는 초가집 마당의 붉은 감나무와 볏짚을 태우는 연기가 낮게 깔린 풍경을 만날 수 있고, 순천만에서는 소설 ‘무진기행’의 한 대목처럼 밤새 진주해 온 안개로 가득한 갈대밭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좀 더 부지런하다면 상사호와 주암호 드라이브와 모후산 깊은 자락의 오지마을에 숨어 있는 정자 초간정의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 향기를 따라 선암사의 경내에 들어서다 늦은 가을에 등황색 꽃이 피는 금목서란 나무를 아시는지. 그 꽃의 매혹적인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 아는 이들만 아는 얘기. 가을날 선암사는 단풍빛 곱기로 알아주지만, 금목서의 꽃향기 덕에 눈보다는 코가 호사를 한다. 산문 아래 작은 연못 ‘삼인당’ 주변에 불붙듯 타오르는 단풍도 좋지만, 그보다 절집 경내와 주변의 금목서와 은목서에 꽃이 피어날 때 온통 절집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으뜸이란 얘기다. 나른한 봄날 선암사 무우전 담벼락에 뿌리를 내린 600년 묵은 고매화 선암매(仙巖梅)가 피워내는 향기가 그윽하고 은은하다면, 가을의 끝자락에 금목서가 뿜어내는 향기는 한층 더 강렬하고 아찔하다. 조계산 자락의 어깨를 타고 넘어 선암사와 송광사를 잇는 고갯길 ‘굴목재’로 들어서는 길. 두 절집을 잇는 길이니 선암사에서도, 송광사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구태여 선암사 쪽을 들머리로 잡은 것은 바로 ‘향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좀 늦었다. 잦은 찬비로 금목서 꽃은 이미 져가고 있고, 향기도 희미할 뿐이니…. 그렇대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선암사 뒤편의 야생차밭에는 지금 순백의 차꽃이 한창이니 말이다. ‘차나무에도 꽃이 피냐’는 질문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차나무는 초겨울 서리 속에서 제법 화려한 흰 꽃을 피운다. 노란 수술을 두른 꽃잎이 어찌나 정갈하게 희던지 그 꽃을 ‘소화(素花)’라 부른다. 이즈음 차밭에 가면 서리 속에 꽃이 구름처럼 핀다 해서 ‘운상화(雲霜花)’라고도 불린다. 선암사의 차밭에는 지금 오백 원짜리 동전만 한 꽃들이 초록의 차이파리 사이에 고운 얼굴을 내밀고 있다. 비록 짙지는 않지만 코를 가까이 대면 은은하게 느껴질 듯 말 듯 향내가 스친다. 초겨울의 선암사에 어찌 꽃향기만 있을까. 오랫동안 고쳐 짓지 않은 선암사의 묵은 절집 아궁이에 나무를 때는 냄새도 그윽하다. 선암사 초입의 자그마한 찻집에서 대추차를 달이는 향기는 또 어떤가. 여기다가 굴목재로 들어서는 선암사 쪽 초입에 힘차게 뻗은 편백나무 숲이 뿜어내는 알싸한 피톤치드의 박하향도 빼놓을 수 없다. 선암사로 드는 길에서 만나는 아치형 승선교의 아름다움과 문화재로 지정된 뒷간, 무우전의 돌확 등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 선암사에서 송광사로…굴목재 넘는 길 굴목재는 길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여느 산길과 그다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숲길이다. 선암사 뒤편의 편백나무 숲과 송광사에 닿기 전 홈통계곡의 고즈넉함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풍경은 없다. 조망이 탁 터지는 자리도 없고, 기암괴석을 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한눈에 확 휘어잡는 경치’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이 길이 매력적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선암사와 송광사, 천년고찰 두 곳을 양쪽 길 끝에 두고 걷는 길이기 때문이다. 선암사와 송광사는 일찌감치 사적으로 지정됐고, 굴목재가 지나가는 조계산 일원은 명승이다. 이 길을 걷는 것으로 사적 둘에 명승 하나를 두루 볼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초겨울 무렵에는 탄력 있는 흙길 위에 울창한 참나무 활엽수의 낙엽이 떨어져 쌓여 정취를 더해준다. 발밑에서 낙엽 서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초겨울의 숲을 걷는 맛이 더없이 상쾌하다. 선암사에서 출발해 편백숲을 지나고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전설이 깃든 호랑이턱걸이바위도 지나서 처음 만나는 고개가 바로 큰굴목재다. ‘굴목’이란 이름은 ‘골짜기를 가로막은 나무’에서 왔다고 전해진다. ‘지하로 굴이 뚫릴 목’이란 뜻으로 불여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계산 동쪽과 서쪽에 댐을 지어 가둔 물인 상사호와 주암호를 연결하는 수로가 이 고갯길 아래 땅속에 놓였으니 그 이름대로 됐다는 후일담까지 덧붙여졌다. 선암사에서 출발해 큰 굴목재까지의 구간은 제법 가팔라서 숨이 찬다. 하지만 이 고갯길만 넘으면 그 뒤부터는 길이 사뭇 유순해진다. 큰굴목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10분쯤 걸으면 산중에 난데없이 마을이 나온다. 고갯길의 옆구리를 치고 능선의 낮은 목 깊숙이 들어서 있는 송광면 장안리다. 여기에 조계산의 명물로 꼽히는 보리밥집이 있다. 굴목재를 넘는 이들에게 그냥 ‘보리밥집’으로 통하는데 식당 이름도 간명해서 ‘조계산보리밥집’이다. 가마솥으로 지은 보리 섞은 밥에다가 갖은 나물 그리고 펄펄 끓인 시래기 된장국으로 차려낸 밥상은 특별한 것 없이 소박하지만, 예까지 걸어온 이들에게는 꿀맛이다. 선암사와 송광사를 잇는 산길의 딱 중간쯤이라 굴목재를 걷는 이들 중 열에 아홉은 여기서 밥상을 받고 평상에 앉는다. 굴목재를 배낭 없이 빈손으로 타고 넘어도 되는 건 바로 이 보리밥집 덕이다. 보리밥집을 지나서 송광사 쪽으로 내려서는 길은 줄곧 계곡을 따라간다. 선암사 쪽에서 건너오면서 잘 들리지 않았던 물소리도 제법 커지고 눈에 띄지 않던 소나무도 울창하다. 이쪽 숲의 단풍은 좀 늦은 편이라 여태 붉은 잎을 달고 있는 단풍나무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바람이 지나가면 우수수 날리는 단풍 이파리들이 계곡물 위로 떨어져 떠내려가는 모습이 제법 운치 있다.
굴목재의 고즈넉한 숲길을 걷다 보면, 조계산 이쪽과 저쪽의 천년고찰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도반(道伴)을 찾아 오가며 교유하던 모습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 상황은 사뭇 달랐다. 이 길은 오래도록 반목과 갈등의 길이었다. 물론 다른 쪽의 절집으로 건너가 법문을 하거나 수행을 했던 이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위세가 비슷했던 두 절집은 ‘라이벌’로 경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쪽에서 법당을 새로 지으면 저쪽에서는 더 좋은 불사를 하려 했고, 저쪽에서 빼어난 탱화를 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쪽에서 탱화작업이 시작됐을 정도였다. 더 오래전의 시간 저편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되 어림잡아보면 적어도 200여 년 전부터는 그래왔다. 송광사 사고(史庫)에 실려 있는 이야기 한 토막. 어느 날 송광사에서 스님들이 다 잠든 야밤에 불이 났는데 누군가 홀연히 나타나 ‘불이야’라고 소리쳐 불난 사실을 일러주고는 관음전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불을 끄고 난 송광사 스님들은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고는 향나무로 동자상을 만들어 봉안했다. 마침 그 무렵 선암사에도 불이 나서 큰 피해를 봤다. ‘송광사에는 영험한 동자상이 있어 불길을 잡는다’는 소문을 들은 선암사 스님들은 고심 끝에 급기야 송광사의 동자상을 훔쳐갔더란다. 그런데 훔쳐 온 동자상도 별무소용으로, 얼마 되지 않아 선암사에 다시 큰 화재가 났다. 이에 실망한 선암사 스님들이 동자상을 산골짜기에 던져버렸다는 얘기다. 이런 반목과 갈등은 해방 이후 조계종의 송광사와 태고종의 선암사의 종단 간 갈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선암사의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순천시가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것으로 임시 봉합됐고 그 이후에도 적잖은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는 양 종단의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됐다. 아직 선암사 재산권 문제는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오랜 갈등이 비로소 해결의 가닥을 잡은 셈이다. 사실 송광사와 선암사의 스님들 간에 교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송광사의 백암 성총 스님이 선암사 창파각에서 법회를 베푼 적도 있었고, 선암사 침굉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송광사의 무용 스님은 한때 선암사 능인전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화가 말을 걸다_10 (0) | 2012.11.25 |
|---|---|
| 한국인의 茶_08 (0) | 2012.11.23 |
| 영화와 함께 떠나는 중국여행_06 (0) | 2012.11.19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09 (0) | 2012.11.14 |
| 화려한 고요 (0) | 201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