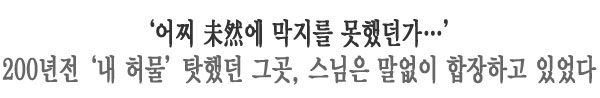 |
비 내려 안개로 출렁이는 적막한 산사에 스님의 독경 소리만 울려퍼지고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 무등산에 오르는 가장 가파른 길을 일부러 찾아 오른 길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이 간절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바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접어두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당도한 무등산의 암자 규봉암. 홀로 절집을 지키고 있는 상좌 일휴 스님이 관음전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을 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기도일까요. 발원문 사이사이로 스님의 기도가 끼어들었습니다. “자비 있는 부처님 원력으로 굽어 살피소서…밝은 세상 총명하고…아이들이 차가운…이내 목숨 버려도…이내 마음 내어주어….” 띄엄띄엄 들리는 스님의 발원문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암자 뒤편 벼랑에 핀 붉은 진달래만 빗속에서 속절없이 지고 있었습니다. 철쭉의 꽃무더기가 화사한 꽃을 피우고, 대지는 신록으로 벌써 가득 찬 계절이지만, 깊은 슬픔에다 대면 지금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슬픔으로, 깊은 내상으로 다친 마음들에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보태기 위해 전남 화순의 절집 세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간절한 마음과 기도만 내어줄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게 절이면 어떻고, 교회면 어떻고, 성당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두 손을 모은 모두의 기도만 가닿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규봉암에서는 푸른 새벽까지 이어지던 기도를, 쌍봉사에서 그곳을 찾은 초의선사가 스물두 살 때 처음으로 지었다는 시 한 편을 만났습니다. “…/남들이야 이 심사를 알 리 없네 / 싫어하고 의심함 사이 피할 길 없네 / 어찌 미연에 막지를 못했던가 / 서리 밟는 지금 오한이 이는구나/….” 쌍봉사를 찾은 초의선사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쓴 시라는데,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쌍봉사의 주지 시공 스님도 발원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때 천불천탑이 있었다던 운주사. 이제는 석불 93구와 석탑 21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절집을 다녀간 이들이 구르는 돌을 주워 쌓은 돌탑들이 곳곳에 서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그 석탑을 지나 천불산 계곡에 누워있던 와불을 만났습니다. 천불천탑을 세우고 일으키면 미륵의 용화세상이 당도한다는 와불. 그 거대한 와불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을, 그 가엾은 아이들을,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부모의 마음을 목도한 이 땅의 누구인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 안개로 갇힌 무등산 규봉암의 목탁 소리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마을에서 무등산의 규봉암으로 오르는 길. 무등산은 다들 ‘광주의 산’으로 알고 있지만, 화순과 담양을 함께 품고 있는 산이다. 규봉암은 무등산 자락이 화순의 경계로 넘어온 자리에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은 “도원마을에서 오르는 코스가 짧긴 하지만 워낙 가파르다”고 말렸다. “비가 오고 있어 가파른 길이 미끄럽기까지 할 것”이라며 “광주의 증심사에서 중머리재를 거쳐 장불재로 가는 길이 더 낫다”고 몇 번이고 권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원이 간절하다면 마땅히 수고를 바칠 일이었다. 이걸 감히 수고라고까지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오라기 실만큼의 도움도 돼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겠다면서 ‘편한 길’을 찾는 건 아무래도 아니었다. 좀 더 어려워야 했고, 가파르고 거친 길이어야 마땅했다. 도원마을에서 무동갈림길까지의 경사도는 26.7%. 거기서 규봉암까지는 경사가 더 급해져 28.7%다. 들머리부터 급한 경사의 길이 가로막았다. 길을 이리저리 ‘갈 지(之)’자로 뉘었는데도 이렇다. 봄비는 쏟아지는데 주위는 온통 안개로 뒤덮였다. 길은 비에 젖어 떨어진 산벚과 진달래의 꽃잎으로 어지러웠다. 이제 막 동그르르 말아올린 새순에서 피어난 보드라운 어린 잎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순마다 빗방울이 동글동글 맺혀 있었다. 무등산 숲길의 나무가 낸 보드라운 새순은 이제 작열하는 햇살에 짙은 진녹색으로 날로 두꺼워질 터인데 이제 막 잎을 내어 연하고 순한 것들에게 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일까. 무동갈림길. 경사는 더 가팔라지는데 비는 그치지 않았고 밀려온 안개 속에서 유독 검은 둥치의 소나무가 하늘을 향해 흑백으로 서있었다. 이윽고 무등산의 자그마한 암자, 규봉암이 가까워왔다는 건 목탁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서석대, 입석대와 함께 무등산의 3대 주상절리대로 꼽히는 광석대의 수직 바위 아래 규봉암이 있었다. 비와 안개에 갇힌 관음전에서 목탁 소리와 함께 발원문을 외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사 스님이 서울로 거처를 옮겨간 뒤에 홀로 암자를 지키는 일휴 스님이 관음전에서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힌 아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냈다. 그 발원이 어찌나 절실하던지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발원을 마친 일휴 스님과 차 한 잔을 놓고 마주앉았다. “발원이 어찌 그리도 절실하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4년 전 천안함 사고 때 백령도의 몽운사에 있었다”고 했다. 당시 스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했다. 주민들의 배를 빌려 구조를 도왔고 신도들과 식사를 해서 날랐다. 실종자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한 한주호 준위와의 생전의 인연을 말하다가 스님은 금세 목이 잠겼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참 아까운 사람이었지요….” 규봉암은 깊고 높은 산에 있지만, 특이하게도 용왕전의 현판을 내건 전각이 있다. 전각 뒤편 수직 바위의 틈에서 물이 솟아 거기에 용왕전을 들였다고 했다. 매무새를 고친 스님이 다시 용왕전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혹은 종교가 없다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 자정이 넘도록 이어진 스님의 간절한 기도에 오래 마음을 보탰다. 이윽고 이튿날 새벽. 아무도 들지 않는 산중의 암자에서 스님은 또다시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을 외고 있었다. 발원문 사이사이로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발원의 문장들이 띄엄띄엄 읽혔다. “자비 있는 부처님 원력으로 굽어 살피소서…아이들이 차가운…이내 목숨 버려도…이내 마음 내어주어….” 무등산을 온통 휘감은 안개는 이튿날 새벽에도 좀처럼 물러가지 않았다. # 초의선사 시 한 줄에 허물을 되돌아보다 화순의 절집 순례는 규봉암을 거쳐 쌍봉사로 이어졌다. 쌍봉사는 예나 지금이나 철감선사 도윤의 것이다. 신라말의 고승 도윤은 경전 공부보다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새로운 불교사상인 선종(禪宗)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강원 영월의 법흥사에서 선종의 9개 파 중 하나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을 열었고, 이곳 쌍봉사를 창건했으며 이곳에서 입적했다. ‘쌍봉’이란 절집의 이름도 도윤의 호에서 딴 것이다.
사실 화순의 다른 절집을 밀쳐놓고 쌍봉사를 찾아갔던 건 부도를 보기 위함은 아니었다. 철감선사 도윤이 입적한 지 1000년이 지난 뒤 이곳을 찾아온 초의선사가 남겼다는 시(詩) 한 구절 때문이었다. 훗날 강진 땅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과 교유하면서 선풍이 감도는 절창의 시를 남긴 초의선사. 그가 스물두 살의 나이에 최초로 썼다는 시의 몇 구절이 이렇다. “…/ 평소 조심했으나 끝내 어긋났으니 / 이런 때를 맞으니 도리어 괴로워라 / 남들이야 이 심사를 알 리 없으니 / 싫어하고 의심함 사이 피할 길 없네 / 어찌 미연에 막지를 못했던가 / 서리 밟는 지금 오한이 이는구나 / 보나니 동녘은 점차 밝아오고 / 새벽 안개는 앞산에서 몰려온다.” 쌍봉사를 찾은 초의선사가 새벽에 철감선사 부도탑으로 이어지는 대숲을 걸으며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진솔하게 고백한 이 시는,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의 허물을 되돌아보게 하는 회한의 글로 읽힌다. 다시 한 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읽는다. “어찌 미연에 막지 못했던가, 서리 밟는 지금 오한이 이는구나.”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주 ‘가톨릭의 성지’ (0) | 2014.04.30 |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13 (0) | 2014.04.29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6 (0) | 2014.04.11 |
| 전북 임실의 섬진강변 (0) | 2014.04.09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12 (0) | 2014.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