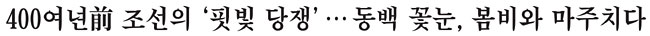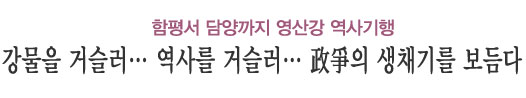 |
그곳에 혁명과 열망이, 그리고 그것에 바쳐진 뜨거운 피가 있습니다. 권력과 암투, 계략과 모함이 판을 치던 세상의 한복판. 불온한 사상으로 모반을 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역사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한 혁명가가 흘렸던 뜨거운 피가 번져 그려낸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거센 소용돌이에 저도 모르게 휘말려 들어가 목숨을 바쳐야 했던 이도 있었고, 물살에서 겨우 발을 빼고 권력의 야만을 환멸하며 평생을 은거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 역사의 생채기를 더듬으며 남도의 땅을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출발한 여정이 나주를 거쳐 화순과 담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광풍과 함께 피바람을 몰고 왔던 ‘기축옥사’와 ‘기묘사화’. 그 두 사건을 길잡이 삼아 이은 여정에서 암투에 따른 권력이동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다섯 번 무너지고, 여섯 번 세워졌다는 서원을 만나기도 했고, 버림받은 한 혁명가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현장과 마주쳤으며, 스승의 최후를 목격한 후학들이 첫마음을 간직하며 심었다는 거대한 동백나무 앞에 서 보기도 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목도한 뒤에 평생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지낸 이가 가꾼 정원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자면 당시의 권력은 때로 야만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당쟁과 사화의 한복판에서 모함과 계략으로 겨눈 칼끝은 늘 비열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정적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싸움이건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당쟁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그래도 이들은 끊임없이 투쟁과 암투를 거듭했습니다. 복수는 다시 복수를 낳고, 죽음은 다시 죽음을 낳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권력을 탐하는 끝없는 욕망? 아니면 목숨을 던져 세상을 바꾸겠다는 치열한 의지? 그 여정에서 내내 영산강의 물줄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속살거리는 봄비에 이제 막 푸릇푸릇해진 강둑을 따라 영산강 물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흐릿한 안개에 휩싸여 흘러가는 그 강물을 따라 한 사람이 죽고, 한 시대가 저물면서 400년이란 시간이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을 거슬러 찾아가는 길. 아 참, 그러고 보니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 비극으로 점철된 숨 가쁜 역사를 만나다 다섯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서원이 전남 함평 땅에 있다. 애초 지어지기 전에도 폭풍 같은 피바람이 불었고, 이후에도 무너질 때마다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나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지면 다시 세워지길 반복했다. 그렇게 다섯 번을 무너지고 여섯 번 세워진 서원이 바로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의 자산서원이다. 자산서원은 조선 중기의 선비 정개청을 기리는 서원이다. 정개청. 벼슬살이는 짧았지만 물러앉아 학문의 길을 걸으며 호남 사람들 사이에서 두루 추앙받던 선비였다. ‘곤할 곤(困)’자를 넣어 ‘곤재(困齊)’라는 호를 쓰고, 펴낸 책에 ‘어리석을 우(愚)’자를 넣어 ‘우득록(愚得錄)’이란 제목을 얹은 것만 보더라도 스스로를 낮추는 그의 선비로서의 품성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400여 년 전, 그는 권력을 전복시킬 음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당시의 역사를 짚자면 숨 가쁘다. 때는 1589년 10월2일. 조정에 황해감사가 보낸 비밀 보고서가 당도한다. 정여립의 역모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혁명을 꿈꿨던 정여립은 조심성이 없었다. ‘천하의 주인이 따로 없다’거나 ‘누구라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왕권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온한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역모에 대한 보고서가 당도하자 조정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3정승과 6판서에다 의금부당상까지 긴급 소집됐고 고변이 내려온 황해도와 정여립이 머물고 있던 전라도에 지금으로 치자면 공안검사 격인 의금부도사가 급파됐다. 조선시대 ‘4대 사화’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기축옥사’의 서막이었다. 곧이어 피를 부르는 잔인한 살육이 시작됐다. 역모에 대한 보복은 잔혹했다. 외가와 사돈까지 모조리 잡혀 죽거나 유배당했다. 정여립과 편지 몇 번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대화 몇 마디 나눴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치 못했다. 정여립과 주고받은 편지 두 통을 갖고 있던 정개청도 그중 하나였다. 옥중에서 대질심문을 요청했으나 정여립은 곧 능지처참돼 조선팔도로 시신이 흩어졌고, 정개청은 항변의 기회 한번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정여립의 모반사건인 ‘기축옥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의견이 엇갈린다. 실제로 사병을 양성하며 권력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당시 치열하게 펼치던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빚어진 모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당시 서인들은 정여립 사건을 빌미 삼아 동인의 거두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은 덕에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다.
# 다섯 번 세워지고 허물어진 서원의 내력 정개청은 죽은 뒤 26년이 지나서야 누명을 벗었다. 역모죄를 뒤집어쓴 스승의 죽음을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던 후학들은 비로소 그가 머물던 윤암정사 자리에 서원을 세우고 그의 학문의 깊이를 기렸다. 그러나 자산서원은 이후 권력의 이동에 따라 수백년 동안 허물어지고 세워지길 반복했다. 서원은 세워진 지 40여 년 만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여립 모반사건이 재조명되며 정개청에 대한 공격이 이뤄졌고, 서인들의 끊임없는 상소에 급기야 서원이 훼철되기에 이른 것이다. 현판은 불태워졌고 기둥은 뽑히고 재목은 헐려서 무안현청의 마구간을 짓는 데 사용됐다. 그리고 다시 20년 뒤 예송 논쟁에서 절치부심하던 남인이 승리하면서 무너진 서원 터에 다시 사우가 섰다. 당시 호남 사람들은 뜻을 모아 임금이 친필로 현판을 내리는 ‘사액’을 요청했고, 임금으로부터 ‘자산서원’이란 이름을 당당하게 하사받았다. 그러나 지은 지 불과 3년 만에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서원은 훼철됐고 남인 100여명이 몰살됐다. 그다음도 마찬가지였다. 서원이 허물어진 지 9년 만에 또다시 남인이 집권해 서원을 복원했다가 곧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무너졌다. 서원이 무너뜨려지면서 건물만 쓰러진 것은 아니다. 정개청을 추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원 건립에 간여하거나 출입했던 선비들도 모조리 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다. 정개청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를 기리는 서원은 서인이 집권하면 무너지고, 남인이 집권하면 다시 세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당쟁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워진 자산서원은 대원군 때 훼철된 이후 1988년에 복원된 것이다. 시골마을 깊숙이 들어서 있는 자산서원은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찾는 이들이 거의 없는 채로 푸릇푸릇 초록빛이 돋는 함평의 너른 들판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서 있다. 들꽃들이 수런거리는 서원의 뜰을 거닐면 무상한 시간과 역사의 무게가 제법 묵직하다. 자산서원을 찾아간다면 지척에 있는 영산강변의 정취를 놓치지 말 일이다. 서원이 있는 엄다리 일대는 함평과 무안, 나주의 땅이 만나는 곳이다. 이 일대를 흘러가는 영산강 줄기를 주민들은 ‘동강’이라 부르는데, 동강을 건너는 동강교 서쪽 사포나루 쪽에서 바라보는 영산강의 경치가 빼어나기 이를 데 없다. 사포나루 뒤쪽의 야트막한 봉우리에 오르면 S자로 휘어져 흐르는 물굽이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 사포나루를 지나 월호리의 용호뜰로 이르는 길에는 자전거길을 따라 그윽한 강변의 정취가 펼쳐진다. 무상하게 흘러간 역사를 반추하는 자리로 유연하게 흘러가는 강을 앞에 두는 것 말고 더 나은 장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 변혁을 기다리며 동백 한 그루 심은 뜻 자산서원에서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의 정자 금사정은 그닥 멀지 않다. 금사정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앞에 심어진 동백나무를 보기 위함이다. 우리 땅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군락지는 여럿이지만, 동백나무 단 한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곳은 여기 하나다. 금사정의 동백은 우리 땅에서 가장 굵고 오래된 노거수 동백나무다. 며칠 내린 봄비에도 우람한 동백의 꽃눈은 단단히 닫혀 있다. 환하게 꽃을 틔우고 모가지가 툭툭 떨어진 꽃을 보는 정취가 있더라면 금상첨화겠지만, 금사정의 동백은 그 꽃의 화려함이 아니라, 심은 뜻을 봐야 하니 꽃이 없더라도 그닥 아쉽지는 않다. 자산서원이 ‘기축옥사’의 피비린내와 함께 반역의 세상의 꿈을 품고 있다면, 금사정 앞 동백나무는 ‘기묘사화’로 좌절된 변혁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던 선비들의 희망이 깃들어 있다. 중종반정의 공로로 요직에 올라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벼슬아치들을 몰아내고, 지방의 신진세력들을 발탁해 급진개혁을 주장했던 조광조가 권력투쟁에서 패해 유배되면서 불었던 피바람이 ‘기묘사화’다. 조광조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의 길로 떠난 뒤,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나주 출신 성균관 유생 11명이 계를 조직해 채 펼치지 못한 개혁의 꿈을 간직한 채 정자를 세우고 그 앞에 나무를 심었다. 그들이 고르고 골라 심은 나무가 동백이었다. 지금 돌이켜 봐도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견디면서 핏빛 선명한 꽃을 피웠다가 모가지째 툭 떨어지고마는 동백이야말로 그들의 끓는 피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나무였을 터다. 금사정의 동백나무를 거쳐 당도한 곳은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의 조광조 적려 유허지. 적려란 귀양 또는 유배돼 갔던 곳을 이르며, 유허비는 인물의 자취를 후세에 알리고자 세워 두는 비석을 말한다. 애우당, 영정각 등 몇 동의 건물에는 그가 사약을 받아 들고 지었다는 절명시를 비롯한 그가 남긴 시구절들이 현판에 걸려 있다. 유허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이 자리 어디쯤에서 조광조가 사약을 받았을 것’이란 데 생각이 미치자, 이루지 못한 그의 열망과 좌절에 가슴 한쪽이 싸하다. #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역사의 흔적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화가 말을걸다_05 (0) | 2012.03.17 |
|---|---|
| 김동률·권태균의 오지 기행_02 (0) | 2012.03.14 |
| 황교익의 味食生活_17 (0) | 2012.03.10 |
| 김동률·권태균의 오지 기행_01 (0) | 2012.03.08 |
| 봄빛 물든 초록 五島 (0) | 201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