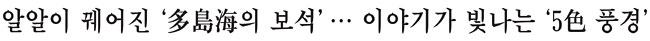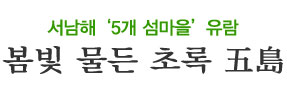 |
이건 일석오조(一石五鳥). 좀 속된 말로 ‘일타오피’입니다. 목포에서 연륙교를 건너 전남 신안의 압해도까지, 압해도에서 배를 타고 암태도로 건너가면 암태도와 더불어 팔금도, 자은도, 안좌도까지 다리로 연결된 네 곳의 섬을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딛고 온 압해도까지 더한다면 한번에 무려 다섯 곳의 섬을 다 들르게 되는 셈입니다. 한번 여행에 섬 다섯 개를 돌며 제각기 다른 정취를 맛볼 수 있다니, ‘남는 장사’도 이만저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마침 봄기운이 완연한 봄날이었습니다. 봄의 훈기를 타고 바다쪽으로 묵직하게 몰려온 연무로 목포 연안의 섬들은 죄다 안개에 감겨 흐릿했지만, 섬들은 온통 초록으로 빛났습니다. 내륙의 땅이 이제 막 푸릇푸릇한 기운이 비치고 있을 무렵이었지만, 압해도에서 철부선을 타고 25분 만에 당도한 섬은 마늘과 대파, 보리밭들이 청청한 초록빛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섬 하나하나씩 징검다리처럼 딛고 가는 길에서는 어디서나 고즈넉한 섬마을의 정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적 없는 고운 모래가 깔린 활처럼 굽은 해변을 걷기도 했고, 섬 한가운데 불쑥 솟은 산에 올라 암봉의 능선을 타고 가며 섬들이 점점이 떠있는 다도해의 전망을 굽어보기도 했습니다. 풀섶에는 작은 들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틔우고 있었고, 제법 거센 바닷바람에도 어김없이 봄의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볕이 따스해서일까요. 포구에는 봄바람에 발이 묶인 배들이 파도에 끄덕거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 당도하는 어떤 섬을 찾아가든지, 이런 봄날이라면 누구든 마음이 한없이 순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작 길이 500m 안팎의 다리로 이어져 오종종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이들 네 곳의 섬들이 서로 달라야 무어 크게 다르겠냐 싶지만, 섬의 풍광은 저마다 다릅니다. 육지로 오가는 길이라면 모를까, 섬사람들이 바닷길로 이웃 섬을 드나들 일은 그닥 없었을 터이니 저마다의 제 특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리로 한데 이어져서 사실상 하나의 섬이 된 뒤에도 그 개성은 여전합니다. 여기다가 저마다 섬이 품은 이야기들도 풍성합니다. 암태도에서는 일제강점기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들불처럼 일어났고, 안좌도에서는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화가 김환기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팔금도에는 고려 때 학정과 수탈을 피해 섬으로 숨어든 이들의 소망이 담겼을 삼층석탑의 위용이 자못 당당합니다. 여기다가 한때 파시의 흥청거림이 다 사라지고 난 뒤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섬이 된 자은도까지 돌아보노라면, 섬들이 보여주는 풍경과 함께 이야기를 딛고 가는 여정이 좀 숨 가쁠 듯합니다.
# 다이아몬드 제도로 건너가는 길 다이아몬드 제도(諸島).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목포 앞바다에 어깨를 맞대고 떠있는 네 곳의 섬을 부르는 이름이 이렇다. 이렇게 부르는 연유는 이들 섬이 주르륵 늘어서 있으되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 가장 먼저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다. 뒤이어 자은도와 암태도 사이에, 그 뒤에 암태도와 팔금도 사이에 다리가 놓였다. 압해도에서 뱃길을 따라 다이아몬드 제도로 드는 길에서 들었던 의문 한 가지. ‘왜 섬들끼리 다리를 놓은 것일까.’ 육지로 이어지는 다리도 아니고, 그래봐야 섬들끼리 길을 잇는 것뿐인데 그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다리를 놓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단견이었다는 것을 섬에 당도하자마자 알 수 있었다. 네 개의 섬이 육로로 이어지면서 이들 섬에는 가히 ‘상전벽해’의 변화가 왔다. 섬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목포에서 출항한 배가 네 곳의 섬을 다 돌자면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육지와 20㎞ 남짓으로 그닥 멀지 않지만, 실제 뱃길은 그보다 수십배나 멀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시간의 거리’가 훨씬 더 멀었던 셈이다. 그런데 다리가 놓인 뒤에는 1시간마다 배가 뜨고, 목포와 연륙된 압해도에서 배를 타면 고작 25분이면 섬에 닿게 됐다. 늘 변방에서 고립됐다고 생각해 오던 섬사람들에게 수시로 뜨는 배와 뱃길의 단축은 아마도 ‘혁명’과도 같은 변화였을 것이었다. 어찌 됐건 이제 섬 사이에 놓여진 다리는 네 개의 섬을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건 ‘교통’에 관한 것일 뿐이고, 네 개의 섬은 다 제각기의 간직한 풍광과 이야기로 여행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제도로 떠나는 여행은 다리로 이어진 ‘하나의 섬’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네 개의 섬에다 목포에서 연륙교를 딛고 온 섬 압해도까지 더해져 ‘일석오조’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 자은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두봉산 섬 하나가 그대로 면소재지인 다이아몬드 제도의 네 곳 섬 중에서 자은도를 맨 앞으로 세우는 까닭은 자은도가 가장 번화하기도 하거니와 해수욕장들도 밀집해 있어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은도에는 네 곳의 섬을 통틀어 가장 높은 봉우리인 두봉산(364m)이 있다. 육지에서라면 300m 남짓의 봉우리를 두고 ‘산’이라 이름 하기 겸연쩍은 노릇이지만, 두봉산은 이래 봬도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전체에서도 가거도의 독실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산이다. 마을 사람들은 태고적 서해안 일대의 섬들이 다 바닷물에 잠겼을 때 두봉산의 봉우리만 물 밖으로 한 말(斗)만큼 나와 있었다고 해서 ‘말봉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때 이웃 섬인 암태도의 승봉산(355m)은 한 되만큼 물 밖에 나왔다고 해서 ‘되봉산’이라고도 부른다던가.
아무튼 다이아몬드 제도로 건너와서 자은도의 두봉산을 올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섬의 절반 이상을 못 보고 가는 것과 진배없다. 암반으로 이뤄진 오름길이 제법 거칠어 밧줄을 잡거나 철제 손잡이를 잡고 올라야 하지만, 해발고도가 그리 높지 않으니 길어야 1시간20분쯤이면 정상에 닿는다. 그러나 섬 산행이 대부분 그렇듯 두봉산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정상에 오르기를 서둘 것이 아니라 오름길에서 펼쳐지는 풍광을 온전히 즐겨야 하는 것이다. 두봉산 정상에 오르면 남쪽으로 자은도와 암태도를 잇는 은암대교가 내려다보이고 그 뒤로 팔금도와 안좌도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북쪽으로는 증도가 손에 잡힐 듯하고, 맑은 날이면 서쪽으로는 흑산도와 홍도까지 바라다보인단다. 바다 전체에 내려앉은 박무로 섬들이 죄다 탁하고 흐릿한 안개 속에 숨어버렸지만, 능선을 따라 오르내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펼쳐지는 경관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었다. 흐리고 안개로 가득한 날이 이럴진대. 맑은 날에 두봉산에서 보는 풍경은 두말할 나위 없겠다. 두봉산에서 내려다보면 자은도는 온통 초록빛이다. 산자락이며 들판에 일궈진 밭에는 마늘이며 대파, 양파, 보리들이 푸르게 물결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은도 주민의 99%가 농업에 종사한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생계를 바다에 의탁하고 사는 이들은 10명 남짓. 그중 7명이 민물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를 잡는다니, 진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은 3명에 불과하다. 자은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파시가 섰을 정도로 어선들이 불야성을 이룬 적도 있지만, 바다는 죄다 외지에서 온 배들에게 내주고 주민들은 땅을 갈아 생계를 이어 왔다. 가난했던 섬 주민들은 배를 살 돈이 없었거니와, 외지에서 온 발동 어선들과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단다. 그렇다고 자은도의 바다가 척박한 것은 아니다. 주변의 해역에는 지금도 숭어와 농어들이 몰려든다. 물 빠진 갯벌에는 낙지가 지천이다. 주민들도 간혹 그물을 들고 고기잡이에 나서거나 삽 한 자루 끼고 낙지잡이를 나서지만, 그저 제 먹을 것을 잡아 오던가, 많이 잡더라도 섬 안의 식당에 대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니 갯벌에 종패를 뿌려놓고는 ‘관광객 접근 시 고발’ 따위의 겁주는 팻말은 없다. 주민들은 외지인들과 함께 낙지를 잡고, 조개를 캐며 서로 웃음을 나눈다. # 거친 기운이 넘쳐나는 곳… 암태도 자은도와 은암대교로 연결된 암태도는 암태(岩泰)란 이름 그대로 화강암으로 우뚝 솟은 섬이다. 뼈대를 이룬 화강암처럼 섬이 지나온 시간도 거칠고 굵다. 암태도는 고려 때부터 흑산도와 함께 주요 유배지로 꼽히던 곳이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뒤 이곳에 유배됐고, 고종 때 안동도호부사도 암투에 휘말려 산성 보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이곳 암태도로 유배왔다. 일대의 이웃 섬들을 다 놔두고 암태도를 유배지로 택했던 것은 아마도 그 황량하고 거친 풍경 탓이었을 터다.
고려말부터 조선 중기 이후까지 섬은 ‘불량한 공간’으로 치부됐다. 왜구들의 침략이 잦아지자 조정에서는 섬 주민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이른바 ‘공도(空島)정책’을 폈다. 섬을 비워 아예 침략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육지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학정과 수탈에 지친 이들이 섬으로 찾아들었다. 왜구의 침략 위협은 있었으되, 그것이 육지에서 견뎌야 하는 허리가 휠 정도의 노역이나 세금보다는 나았다. 그렇게 주민들은 하나둘 섬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들어온 섬에서 이들은 왜구를 격퇴하기도 했다. 이런 전과는 특히 암태도에서 두드러졌다. 조선 태종 때 암태도에 왜선 6척이 출몰했다가 섬에서 소금을 굽던 염부가 왜적을 쏘아 죽이고 물리쳤고, 2년 뒤에는 암태도에 상륙해 도둑질을 하던 왜적 9척을 염부들이 쫓아버리기도 했다. 행정은 비어 있되 섬은 비어 있지 않았다. 그 갈등의 공간에서 섬 주민들은 소금을 굽고 고기를 낚고 농사를 지었다. 암태도 해안가에서 근래에 발견된 매향비는 당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매향비는 고려말 조선초 무렵 갯가에 향나무를 묻고 1000년이 지난 뒤 떠오른 나무로 향불을 피우면 미래를 구원해줄 미륵이 출현한다고 믿은 종교의식을 기록한 비석이다. 불가에서 중생을 구원하러 오는 미륵이 당도하는 시기는 무려 56억7000만년 뒤. 현실의 질곡을 견디며 그 긴 세월을 기다리지 못한 이들이 향나무를 묻고 미륵을 기다렸다. 그때의 기록을 담은 매향비가 800년의 시간을 건너와 암태도의 해안가에 서 있다. 그들이 꿈꾸던 미륵의 현생은 아직도 200년을 더 기다려야 하리라.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교익의 味食生活_17 (0) | 2012.03.10 |
|---|---|
| 김동률·권태균의 오지 기행_01 (0) | 2012.03.08 |
| 황교익의 味食生活_16 (0) | 2012.03.03 |
| 시와 함께하는 우리 산하 기행_08 (0) | 2012.02.29 |
| 동양화가 말을걸다_05 (0) | 201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