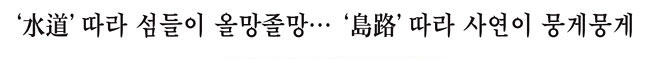|
요즘처럼 연일 뜨거운 폭염 아래 도보여행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쪽바다 한려수도에 떠있는 섬 두 곳에 당도해 비밀처럼 깊고 짙은 숲의 오솔길에 들어섰을 때도 내내 비오듯 땀을 흘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온통 양철지붕처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폭염의 기세가 좀 수그러들고, 해무를 몰고 다니는 바닷바람이 좀 더 선선해진다면 줄곧 한려수도의 빼어난 경관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낭만의 정점’을 만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보람이 어디 경치뿐이겠습니까.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심은 또 얼마나 푸근하던지요. 혹 기세등등한 더위 속에 서둘러 이들 섬을 찾아간다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섬 안에 난 도보길을 다 걷지 않는다 해도 그 섬에는 바닥이 훤히 비치는, 비밀처럼 오붓한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이 있으니까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바다 위의 국립공원인 한려수도에 ‘걷는 길’을 놓았습니다. 이름하여 ‘한려해상 바다 100리 길’입니다.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도보여행 코스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종국에는 길들이 중복되고 얽혀 ‘난개발’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길만큼은 좀 다릅니다. 그 길은 최고의 바다 풍광을 지니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이런 경관을 늘 마주하고 생활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직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가려 뽑은 길이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섯 개 코스로 이뤄진 한려해상 바다 100리 길은 모두 경남 통영의 앞바다에 그림처럼 떠있는 섬 안에 놓였습니다. 연륙교가 놓여 있는 통영의 미륵도에는 산자락을 타 넘는 길이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는 한산도, 비진도, 연대도, 매물도, 소매물도에는 해안을 따라 오솔길을 도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100리 길은 2015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삼았으니 아직 모든 코스의 정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인위적으로 새로 놓은 게 아니라 섬주민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니던 지겟길이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드나들던 길을 이은 것이니 구태여 완성을 기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코스마다 도보길은 이었으되 아직 시설물을 들이지 않은 지금의 손대지 않은 풍경이 더 낫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섯 개 코스 중에서 연대도와 비진도, 두 개의 섬 안에 놓인 길을 다 걸어봤습니다. 바다 100리 길이 놓인 미륵도와 한산도, 매물도에 비해 덜 알려진 곳들입니다. 이틀 동안의 걸음으로 돌아본 한려수도의 작은 섬 연대도와 비진도는 빼어난 풍경도 풍경이었지만, 그보다 푸근한 섬의 정서가 더 따스하고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다 100리 길을 가게 되거든 특히 작은 섬 연대도를 주목해 보시길. 그 섬에서는 주민과 방문객이 교감하는 공동체의 실험과 함께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동력과 에너지를 얻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연대도에서 ‘낙도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한려해상의 섬에서 바닷길 100리를 따라 걷다 한려수도(閑麗水道). 경남 통영의 한산도에서 여수의 오동도에 이르는 남해안 물길 200리를 이르는 말이다. ‘한려’는 한산도의 ‘한(閑)’ 자와 여수의 ‘여(麗)’ 자를 붙여 지은 것. ‘수도(水道)’란 뜻 그대로 ‘물길’을 말한다. 한려수도란 이름은 누가 따로 지은 게 아니라 1932년 부산~여수 항로가 개설된 이후 통영, 여수 일대의 다도해를 오가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그 뱃길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그랬을까. 그러다 1953년 ‘한국 8경’을 정할 때 통영상공회의소가 ‘한려수도’란 이름으로 응모해서 뽑히고 난 뒤부터 한려수도는 공식 명칭이 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려수도의 여섯 개 섬에 도보여행 코스 ‘한려해상 바다 100리 길’을 놓고 있다. 동해처럼 물마루가 거칠지도 않고 서해처럼 파도가 바쁘지도 않은, 고래등처럼 부드럽고 넓적하게 밀려오는 남해의 바다. 양식장의 부표들이 물이랑을 일궈 놓고 정연하게 떠있는 풍경을 거느리고 있는 섬 깊숙이 그 길이 놓이고 있다. 바다 100리 길은 모두 6개 구간. 이 중에 2개 구간을 택했다. 미륵도와 한산도를 건너뛰고 3구간과 4구간의 비진도와 연대도를 찾아 들어간 길이다. 비진도와 연대도는 낯설다. 통영항에서 배로 40분 남짓. 산호빛 바다를 거느린 비진도는 외지 사람들에게는 그닥 알려지지 않은 섬이지만, 통영 사람들은 여름휴가지로 이 섬의 해변을 첫손으로 꼽는단다. 그것만으로도 비진도의 빼어남은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연대도는 비진도보다 섬의 크기가 훨씬 작고, 그만큼 더 낯설다. 48가구에 주민 수 80여 명의 자그마한 섬. 하지만 그 섬에서는 주민들의 삶이 짙게 묻어 나온다. 마을 뒤편에 숨은 자그마한 몽돌해변의 은밀한 맛도 그만이다. 게다가 이 섬은 화석에너지를 태우는 대신 태양광과 지열로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한려수도의 자그마한 섬이 ‘낙도의 과거’가 아닌 ‘지속가능한 섬’으로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집집마다 내건 문패가 한 편의 시가 되다 미륵도 달아마을 선착장에서 35t짜리 여객선 ‘섬나들이호’를 타고 뱃길로 20분 남짓. 그곳에 작은 섬, 연대도가 있다. ‘연대(煙臺)’란 이름은 오래전 섬의 산 정상에 봉화를 피웠던 자리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봐야 230m 남짓이지만 연대봉은 훤칠하게 솟아있다. 달아마을 쪽의 통영수산과학관에 올라 앞바다에 떠있는 섬들 중에서 연대도를 찾는 일은 그래서 쉽다. 시야가 닿는 섬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진 섬을 찾으면 그게 연대도다. ‘섬나들이’란 이름답게 여객선은 만지도와 저도, 송도, 학림도 등 통영 앞바다의 고만고만한 섬을 도는데, 이게 순서가 없다. 정해진 항로가 있긴 하지만 바쁜 일이 있는 승객이 있으면, 그가 가려는 섬부터 찾아간다. 그렇게 항로를 바꿔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여객선은 이름처럼 바다 나들이를 나선 듯 느긋하게 미끄러진다. 한려해상 100리 길을 풍광만으로 보자면 비진도나 매물도 구간이 단연 압권이지만, 구태여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 연대도를 앞세우는 까닭은 그곳에서 섬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도에 내려서 40여 가구 남짓의 마을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붙잡는 것이 집집마다 내건 문패다. 연대도의 문패는 색다르다. 이름만 덜렁 적어 놓은 도회지식 문패가 아니라 집주인의 성품과 이력 등을 정감 넘치게 써 붙였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서태동, 정상영 부부의 집 앞의 문패. ‘정치망어업을 하는 부부의 집. 민박도 합니다. 민화투를 즐기시는 이야무 할머니와 함께 사십니다.’ 이번에는 이도태 할아버지 집 문패를 보자. ‘관광버스에서 이박삼일 동안 춤을 추어도 끄떡 없습니다. 두릅농사를 많이 지으십니다.’ 하나만 더 보자. ‘윷놀이 최고 고수 사재목, 손재희의 집’에는 ‘목소리 크고 음식솜씨 좋은 아내 손재희, 연대도 개그맨 서재목 씨가 달리기를 잘하는 김동희 할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란 문패가 써 붙여져 있다. 문패를 읽다 보면 한 편의 시(詩)가 따로 없다. 이 문패는 통영의 시민사회단체인 ‘푸른 통영 21’ 활동가의 작품이다. 외지인들이 어찌 섬사람들의 사정을 이리도 속속들이 알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예 활동가들이 섬 안에서 몇 년째 상주하다시피 한단다. 이런 문패가 가져다주는 ‘관계’의 효과는 마법과도 같다. 문패를 읽다 보면 그 집 주인과 마치 예전부터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문패가 걸린 집에서 삐걱 문을 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오면 저절로 인사를 하게 되고 말을 건네게 된다. 문패로 알게 된 몇 줄의 사연만으로 섬 주민들과 인연의 끈을 새로 맨 것 같은 기분이다. 골목에 돗자리를 깔고 옥수수를 나눠 먹고 있는 할머니들 틈에 자연스레 끼어 앉아 옥수수 하나를 받아들게 되는 것도 이런 정겨운 느낌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작은 섬마을 연대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화석연료 제로’로 가는 섬 개발의 미래를 보다 연대도에 놓인 한려해상 100리 길은 섬을 한 바퀴 도는 일주코스다. 이 길은 마을 주민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니거나 반대편 마을 쪽으로 마실을 가던 코스였다. 길은 선착장이 있는 마을에서 시작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다. 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 수 있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경사도가 완만해 힘이 훨씬 덜 든다. 마을 뒤편에서 시작되는 길은 곧 몽돌해안 옆을 지난다. 반질반질한 검은 돌이 뒹구는 몽돌해안은 연대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작지만 불룩하게 솟은 바위산 가운데 있어 은밀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해안선의 길이는 고작 20m쯤이나 될까. 이런 오붓한 해변에 자리 잡고 해수욕을 즐긴다면 이름난 해외리조트의 프라이빗 해변도 전혀 부럽지 않겠다. 몽돌해안을 지나면 곧 숲이 짙어진다. 숲속 여기저기서 또르르 말린 태엽이 풀리듯 휘파람새의 탄력 있는 울음소리가 이어진다. 순한 매미소리도 줄곧 따라온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온통 청색의 바다다. 시야가 해송에 가려 탁 트이는 전망은 없지만, 솔숲 가지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바다는 더없이 정겹다. 전체 코스는 2.3㎞로 길지 않다. 쉬엄쉬엄 걷는다 해도 1시간30분 정도면 다 돌아볼 수 있다. 섬을 한 바퀴 돌아 마을 쪽으로 들어서는 길목에는 ‘에코체험센터’로 운영되는 폐교가 있다. 통영의 한 시민사회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녹색교육을 위한 대안에너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자전거로 발전기를 돌려 노래방기기를 가동하거나 솜사탕을 만들고, 태양열로 음식을 조리해 보는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연대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속가능한 섬 개발’의 모델을 일구는 사업에서 비롯됐다. 푸른 통영 21과 통영시, 그리고 연대도 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연대도를 환경과 생태를 보전하는 섬 개발의 모델로 지정해 ‘화석에너지 제로의 섬’에 도전하고 있다. 겨울에도 별도의 난방 없이 지낼 수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짓고, 마을 뒤편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사업의 일환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연대도는 낙도 시절의 소작과 가난의 과거에서 벗어나 ‘친환경 녹색개발’을 지향하는 미래의 섬마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빼어난 해변 경관을 보며 걷는 비진도 산호길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인의 茶_02 (0) | 2012.08.10 |
|---|---|
| 황교익의 味食生活_28 (0) | 2012.08.07 |
| 李龍在의 맛있는 상식_08 (0) | 2012.08.01 |
| 김동률·권태균의 오지 기행_06 (0) | 2012.07.31 |
| 강원평창 "청정계곡" (0) | 2012.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