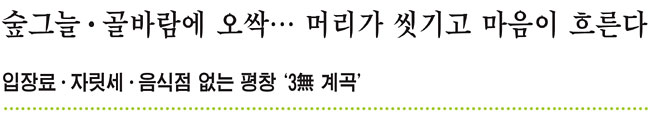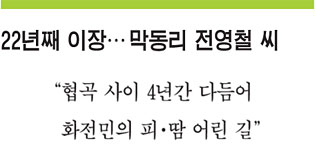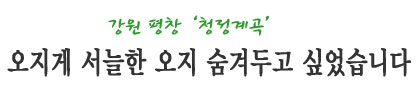 |
여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올여름 휴가 목적지 말입니다. 사진에 담은 곳이 강원 평창 막동계곡의 삼단폭포입니다. 콰르르 흘러내리는 수정 같은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물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반팔의 소매 아래 팔뚝에 오스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폭포 아래 초록빛 소(沼)에서 물놀이를 하던 근육질의 청춘들도 금세 입술이 새파래져서는 물가에 나와 햇볕에 몸을 말리더군요. 달궈진 양철지붕 같은 열기도, 훅하고 끼치는 습도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콰르르 쏟아지는 청정한 물과 옷깃이 여며지는 서늘한 기운만이 있을 뿐입니다. 청정한 계곡의 물소리와 도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한 매미소리, 그리고 앞산의 뻐꾸기 소리까지 합쳐져 알싸한 박하향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시에서 늘어져 있던 온몸의 근육이 탱글탱글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창 땅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은, 아니 덜 닿을 것 같은 계곡들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피서철의 오지에 대한 개념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인적조차 드물다가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 적잖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명소라 해도 피서 인파들로 넘쳐나면 그것 또한 더위 못잖은 스트레스입니다. 피서철에 인파가 얼마나 몰릴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감안해 나름대로의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먼저 입장료가 없어야 합니다. 입장료가 있다는 건 피서객들이 적잖이 몰려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입장료가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파는 것 정도야 눈감아 주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릿세가 없어야 합니다. 계곡가에 그늘막 하나 쳐놓고 돈을 받는 곳은 다 제외했습니다. 자릿세를 내지 않고도 빈터에 텐트를 칠 수 있다면 가산점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부근에 음식점들이 없어야 합니다. 식당 두어 곳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음식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은 보나 마나 피서철에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평창의 곳곳을 속속들이 뒤져봤더니 한적하게 더위를 쫓을 수 있는 곳들이 적잖이 남아있더군요. 꼭꼭 숨겨져 있어 피서객들은 잘 모르는 곳도 있었고, 한때 널리 알려졌다가 차츰 잊히면서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백석산 자락의 막동계곡, 이 계곡과 이웃한 가리왕산의 장전계곡, 여기다가 봉평의 팔석정 계곡을 끼워 넣었습니다. 막동계곡과 장전계곡은 깊고 서늘한 그늘과 굽이치는 계류가 빼어난 곳이고, 팔석정은 깊은 맛은 전혀 없지만 여덟 개의 바위에 붙여진 이름만으로도 풍류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장맛비를 머금은 강원도 일대의 산자락이라면 어느 계곡이나 지금 맑은 물로 넘쳐나고 있답니다.
# 삼단폭포 아래 최고의 피서명소… 막동계곡 삼단폭포가 그려내는 화려한 물줄기가 아니라면 막동계곡은 더 오래도록 꼭꼭 숨겨져 있었으리라. 오대산에서 발원해 흘러내리는 오대천의 물굽이를 따라가는 59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진부쪽에서 정선 쪽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차로 달리다 보면 백석산 자락의 협곡을 타고 내려와 오대천과 합류하는 폭포가 대번에 눈길을 붙잡는다. 이른바 삼단폭포다. 그 폭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막동계곡이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당당하게 리(里)의 행정구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구 수래야 서른 집 남짓. 그것도 오대천 이쪽저쪽에 띄엄띄엄 들어선 독가촌들이 대부분인데다 빈집을 빼고 나면 주민 숫자는 스무 명쯤이 고작이다. 3㎞ 남짓 이어지는 계곡은 깊고, 깊은 산중을 흘러내리는 물은 맑고 차갑다. 숲 그늘은 또 얼마나 짙은가. ‘청류(淸流)’란 이름은 바로 이런 계곡의 물에 붙여져야 마땅하리라. 막동계곡에서 가장 명당이라면 삼단폭포 아래다. 폭포가 뿜어내는 바람과 물안개로 폭포 아래는 서늘하다. 그 폭포 한쪽에 마을 주민들이 파라솔을 편 테이블 두 개를 가져다 놓았는데, 여기에다 짐을 풀 수만 있다면 여름휴가를 보내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자릿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저 얌전히 놀다가 쓰레기만 남기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환영이다. 마을 주민들이 자그마한 야영장 입구에서 500원짜리 쓰레기봉투 두 장씩을 팔고 있지만, 내가 내놓은 쓰레기만 가져간다면야 그거야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다. 봉투를 파는 게 돈을 남기는 장사가 아닌 까닭이다. 폭포 위쪽에는 자그마한 캠핑장이 있다. 사유지라 텐트를 치면 자릿세를 받고 있지만, 비좁긴 해도 계곡을 따라 텐트를 칠 자리가 군데군데 있다. 통행에 불편만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 텐트를 쳐도 돈을 받지 않는다. 계곡에 딸린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 피서객들이 찾아오면서 불편함이 왜 없을까만 주민들은 외지인들을 환대한다. 막동리 이장은 “그게 막동리의 인심”이라고 설명했다. 폭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도 놀 자리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계곡으로의 접근이다. 계곡은 길고 깊지만, 물길의 오른편을 따라가는 계곡 길은 가파른 경사를 차고 오른다. 이 길을 따라 1㎞ 남짓만 올라가면 물길은 까마득한 벼랑 아래에 있다. 아슬아슬한 벼랑 아래로 짙은 숲 속의 물길이 굽어 보인다. 이쯤이면 계곡이라기보다는 협곡이라 해야 옳을 듯하다. 계곡과 길의 형세가 이러니 상류쪽에서 물놀이를 즐기겠다면, 물길을 따라 바위를 딛고 거슬러 올라야 한다. 하지만 계곡이 워낙 깊은데다 물살도 힘차서 웬만한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다. 드문드문 들어서 있는 펜션 두어 곳을 지나 이끼 낀 물속의 바위를 딛고 더 오른다면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그야말로 원시림의 계곡이 선물처럼 나타난다. 거기서 계곡 곳곳의 맑은 소(沼)에서 헤엄을 쳐도 좋고, 굽이치는 계류에 발을 담가도 좋고, 아니면 서늘한 계곡의 기운을 느끼며 숲 그늘 아래 낮잠을 자도 좋다. 이미 막동계곡에 들어서는 순간 ‘최고의 휴가’가 거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바닥이 훤히 비치는 맑은 소… 장전계곡 막동계곡이 오지로 남아있던 것은 어찌 보면 장전계곡 때문이기도 하다. 막동계곡과 장전계곡의 거리는 불과 300m 정도. 하지만 오대천과 만나는 하류가 그렇다는 것이지 계곡을 따라 오르면 계곡의 물길 방향은 전혀 다르다. 막동계곡은 백석산에서 발원하고, 장전계곡은 가리왕산에서 흘러내린다. 계곡의 규모면으로 보자면 막동계곡보다 장전계곡이 더 크다. 그러니 막동계곡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장전계곡은 몇 해 전만 해도 상류쪽의 이끼로 뒤덮인 이른바 ‘이끼계곡’이 명소로 꼽혔었다. 온통 이끼로 뒤덮인 청량한 계곡은 사진가들을 비롯해 피서객들을 불러모았다. 그러나 잇단 수해와 사람들의 발길에 이끼계곡이 훼손되자 사람들의 출입이 뜸해졌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휴가 때면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지금은 휴가철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다. 마을 한쪽에 번듯한 캠핑장도 마련해 두었지만, 지금은 요금을 받는 이조차 없다. 마을 안쪽에서 성업을 이루던 민박집들마저 썰렁하다. 마을 주민들은 휴가철 외지사람들이 몰려들 때를 한 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3년 전쯤에는 피서철에 이 계곡에 300대가 넘는 차가 밀려들었다”며 “계곡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피서객들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아마도 이것저것 편리한 시설들이 있는 피서지가 많이 늘어서 일 것”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편리한 시설의 휴가지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런 청정하고 서늘한 계곡에 피서객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지 않았다. 장전계곡에 들어서면 눈이 먼저 호사한다. 어찌나 계곡물이 맑은지 고인 소마다 초록빛으로 푸른 빛으로 투명하게 빛난다. 장마 때 그득 물을 품은 계곡의 물살은 제법 힘차다. 계곡가의 짙은 숲 아래서는 물이 뿜어내는 찬 기운만으로 서늘하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자 찬 기운에 금세 발가락이 오그라든다. 웬만큼의 더위로는 몸을 담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다. 굳이 상류로 올라갈 것도 없이 하류쪽에도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은 소들이 그득하다. 곳곳에 반석이 있어 물놀이를 하기에 더없이 좋다. 계곡 입구에서 3㎞쯤 가면 왼쪽 대궐터 계곡과 오른쪽 암자동 길로 나뉜다. 대궐터란 이름은 옛날 맥국의 가리왕이 예국의 공격을 피해 그곳에 대궐을 지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 이끼계곡이 그 자락에 있다. 피서를 하겠다면 대궐터쪽보다는 오른편 암자동 계곡쪽이 더 낫다. 계곡의 규모는 작지만 제법 번듯한 캠핑장도 갖추고 있는데다 군데군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만그만한 소들이 깔려있다. 온 가족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 한쪽 깨먹기에 딱 좋다. # 풍류넘치는 물가서 보물찾듯 글귀를 찾다… 팔석정 막동계곡과 장전계곡이 짙은 숲을 품은 자연미 넘치는 계곡이라면, 평창의 팔석정은 그윽한 옛사람들의 풍류를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팔석정은 봉평면 평촌리의 앞들을 흘러내리는 흥정천에 자리 잡은 명승지다. 논을 따라 이어지는 평범한 물길이 솔숲 울창한 바위를 만나 굽어 치는 곳인데, 여덟 개의 큰 바위가 있다고 해서 ‘팔석정(八石亭)’이란 이름이 붙여진 곳이다. 그렇다고 바위가 여덟 개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물길이 굽어 치는 곳에 뒹구는 기암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팔석이란 이름은 조선조에 강릉부사를 지낸 양사언이 지어붙인 것이다. 양사언은 정작 정사보다는 풍류를 더 즐겼던지 전국 곳곳의 이름난 명소마다 글귀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양사언은 영동, 영서지방을 돌며 풍치 좋은 곳에 머물며 풍류를 즐기기도 했다. 강릉부사였던 그가 이곳 평창의 팔석정을 찾은 것은 이곳이 조선시대에 강릉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곳 팔석정의 경관에 매료돼 8일 동안 머물며 ‘8일정’이란 정자를 세워두고, 1년에 3번 봄, 여름, 가을에 이곳을 찾아왔다고 전한다. 그러다가 임기를 마치고 강원 고성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그는 이곳 바위마다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를 새겨넣도록 했다. 봉래, 방장, 영주 등 금강산과 지리산, 제주도의 옛 이름을 딴 것도 있고, 낚시던지기 좋은 바위(석대투간·石臺投竿), 낮잠자기 좋은 바위(석실한수·石室閑睡) 등도 있다. 이름이야 여러가지지만 이래저래 놀기 좋다는 뜻이겠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李龍在의 맛있는 상식_08 (0) | 2012.08.01 |
|---|---|
| 김동률·권태균의 오지 기행_06 (0) | 2012.07.31 |
| 한국인의 茶_01 (0) | 2012.07.27 |
| 축제 따라 걷기_함양 산삼축제 (0) | 2012.07.26 |
| 제주 야경 즐기기 (0) | 2012.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