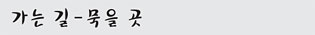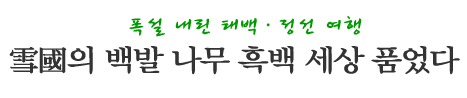 |
예년의 경우 이쪽에 폭설이 쏟아지는 것은 보통 1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보통 12월까지는 서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고, 비슷한 시기에 강원 산간지역은 극심한 겨울가뭄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1월 중순쯤 돼야 이쪽에 제법 눈다운 눈이 내렸지요. 이런 사정은 태백산 눈축제가 해마다 1월말쯤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일찌감치 쏟아진 눈으로 강원 산간은 온통 눈세상입니다. 쌓인 눈이 웬만한 곳은 무릎을 넘었고, 깊은 계곡에는 아예 허리까지 푹푹 빠질 정도입니다. 제설로 밀어낸 눈들이 어깨 높이의 설벽(雪壁)을 이루고 있는 도로를 따라 강원 정선과 태백이 만나는 백두대간의 능선으로 눈을 만나러 갑니다. 눈 구경을 위해 이쪽으로 길을 잡은 까닭은 그곳에 ‘민족의 영산(靈山)’ 태백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태백(太白)은 도립공원이고, 소백(小白)은 국립공원이라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말입니다. 태백이 품은 영험한 기운을 말하면서도 태백산에 대한 홀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겨울에 온통 눈꽃이 피어난 태백을 밟아본다면, 칼바람 몰아치는 태백 마루금에서 어떠한 수식도 필요없는 웅장한 능선을 굽어본다면, 일출의 풍경 앞에서 저무는 해의 아쉬움과 다시 솟을 해에 대한 기대를 품는다면 태백산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온통 눈세상이 된 만항재의 낭만적인 설경,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암사의 그윽한 설경도 빼놓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태백 준령의 넘실거리는 능선들은 지금 온통 눈으로 가득합니다. 낙엽을 다 떨군 낙엽송에는 가는 가지마다 내린 눈이 얼어붙었고, 산자락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푸른 빛이 감도는 눈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덮인 전나무들은 그대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솟아 있습니다. 태백과 정선의 깊은 산중에 쌓이기 시작한 눈은 겨우내 녹지 않고, 앞으로 내리는 눈까지 더해지겠지요. 강원 산간의 겨울 초입 풍경이 이러니, 이쪽에서는 올 겨우내 눈 구경의 호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눈꽃으로 가득한 태백산에서 만나는 일출풍경 거친 산자락의 능선을 바람처럼 내달리는 준족들이나, 경험 많은 베테랑 산꾼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눈 구경’하겠다며 여행 삼아 설산(雪山)을 찾는 이들에게 겨울산은 두려움에 가깝다. 무릎까지 눈에 푹푹 빠지거나 단단하게 얼어붙어 미끄러운 등산로도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금세 뻣뻣하게 얼어붙는 추위와 능선을 타고 넘는 매서운 칼바람은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눈 덮인 겨울산을 딱 한 번이라도 올라보았다면, 더구나 그 산이 태백산이라면 이런 두려움쯤은 단번에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태백산은 가슴이 터질 듯한 오르막도 없고, 아찔한 암봉도 없다. 산세는 웅장하지만 능선은 부드럽다. 해발 고도는 1567m에 달하지만 가장 빠른 코스를 택하면 2시간 남짓이면 정상에 가닿는다. 태백은 또 겨울의 비장미와 썩 잘 어울린다. 일찍이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온 곳이 바로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다. 신과 인간이 처음 만났던 ‘신령의 산’이란 느낌은 태백의 온 천지가 눈으로 뒤덮여 겨울의 비장미를 뿜어낼 때 비로소 실감이 난다. 태백이 대표적인 ‘겨울산’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사실 눈 내린 태백산에서 산행 소요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나뭇가지마다 서리가 얼어붙은 상고대와 눈이 얼어붙은 설화에다 눈의 무게를 못이겨 휘어진 가지 사이로 걷다보면 오히려 그 길이 짧은 것이 못내 아쉬워질 정도이니 말이다. 겨울 태백을 찾는 이들은 대개 유일사 입구를 기점으로 택한다. 이쪽에서 오르는 게 가장 쉬운 코스라는 점도 있겠고, 등산객들의 왕래가 잦은 코스라 눈길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일사까지는 길이 뚜렷해 거의 대로나 다름없다. 눈이 소리를 빨아들이는지, 사위는 고요한데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만 데리고 호젓하게 걷는 길이다. 본격적인 산길은 유일사부터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나무마다 피어난 눈꽃들이 화려한 풍경을 보여준다. 여기서 풍경의 수준을 가르는 것은 시간대다. 되도록 눈 내린 이튿날, 혹은 기온이 급강하한 날을 겨누고 일찌감치 등산로에 올라붙는 게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낭만적인 풍경을 만나는 요령이다. 그중에서도 새벽 서너시쯤 산행을 시작해 일출 직전에 장군봉이나 천제단쯤에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늘과 맞닿은 채 굽이치는 능선에서 만나는 장엄한 일출, 그리고 아침 볕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의 가장 아름다운 상고대와 설화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만항재, 잘 단장된 설경을 만날 수 있는 곳 칼바람 속의 겨울 태백산행이 엄두가 나지 않거나, 힘겨운 등산보다 가볍게 설경의 정취를 즐길 생각이라면 정선에서 영월로 넘어가는 고갯길 만항재를 찾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 태백산을 다녀온 길이라 해도 만항재의 설경을 놓치고 돌아가는 건 아니될 말이다. 만항재는 태백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 함백산 자락을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만항재의 해발고도는 1330m. 고갯길이란 대개 능선과 능선의 가장 낮은 목을 넘어가지만, 인근의 산들이 워낙 높은 탓에 고갯길의 고도가 웬만한 산의 정상 높이를 넘는다. 그러니 만항재에는 한번 눈이 내려 쌓이면 봄이 올 때까지 겨우내 눈이 쌓인다. 만항재의 설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돈된 아름다움’이다. 만항재는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는 야생화로 이름난 명소다. 그러나 겨울의 매력도 그에 못지않다. 기온이 급강하한 날 아침에 낙엽송 가지마다 서리가 얼어붙어 상고대가 만들어지면 그 풍경은 가슴이 저릿할 정도로 아름답다. 야생화가 피고 지던 초지는 온통 눈 이불로 덮이고 그 위로 솟은 나무들이 모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면 그 아름다움에 그만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다. 만항재의 눈 구경은 편안하다. 고갯길 정상의 휴게소에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설경을 즐겨도 좋겠고, 간이매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눈 쌓인 숲을 오래도록 바라봐도 좋다. 만항재 아래 소공원으로 들거나 위쪽의 산책로로 들어서 순백의 눈으로 치장된 낙엽송 사이로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딛고 걸어보는 맛도 그만이다. 만항재를 찾았다면 이른바 ‘오대 적멸보궁’ 중 하나로 꼽히는 정암사를 들러보자.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집을 뜻하는 말인데 정암사에는 절집 뒤편 산자락에 세워진 수마노탑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 눈 내린 직후의 정암사는 아예 눈으로 포위된다. 열목어가 산다는 물길을 끼고 들어선 절집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온통 눈 천지다. 눈 내린 날 정암사의 명물이라면 육화정사 옆의 마가목. 가지마다 매달린 빨갛게 익은 마가목 열매는 마치 순백의 도화지에 떨어뜨린 선명한 붉은 잉크처럼 풍경에 악센트를 준다. 또 죽은 둥치에서 새 로 자라는 적멸궁 앞의 주목에 눈이 내려 덮인 모습도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음식 기행_07 (0) | 2011.12.21 |
|---|---|
| 한시 양식의 소통성과 그 양상 (0) | 2011.12.20 |
| 황교익의 味食生活_12 (0) | 2011.12.11 |
| 꿈에 세운 詩의 나라 (0) | 2011.12.10 |
| 물이 되는섬 고흥 거금도 (0) | 201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