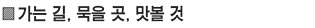|
거두절미. 전북 고창 땅에 기이하게 서 있는 세 채의 집. 선계(仙界)와 속계(俗界)의 경계쯤에 아슬아슬 서 있는 그 집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족히 한 달쯤 앞서 피기 시작한 선운사의 성급한 동백 소식도, 봄까치꽃과 광대나물 푸릇푸릇 돋기 시작한 고창 읍성의 봄 정취도, 말 잔등처럼 부드러운 황토 구릉마다 번져가는 진초록 청보리의 푸르름도 다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고창의 인천강변에 수직으로 아찔하게 치솟은 바위 두락암. 그 수직의 바위 동굴에 지붕과 처마를 밀어 넣어 지어낸 정자 두암초당이 있습니다. 수직의 바위에 매어놓듯 한 칸짜리 방을 내고, 거기에 누마루 두 칸을 더 보태서 지은 정자입니다. 서늘한 높이와 그윽한 풍류가 만나는 자리. 정자는 그 경계에서 400년 동안 한 편의 시(詩)처럼 서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현기증 나는 그 아찔한 자리에 솜씨 부려 정자를 세운 이의 담력도 담력이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고서 정자를 들인 옛사람의 눈썰미가 더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두암초당이 수직의 단애에 기대서 지은 집이라면, 무장면의 용오정사는 뒤틀리고 휘어진 것들로 오히려 힘차게 일으켜 세운 집입니다. 서원과 사당을 겸한 용오정사에서 기숙사 역할을 하는 홍의재. 그 건물은 온통 둥치를 뒤튼 휘어진 나무로 기둥을 삼았습니다. 섣불리 자르지도 다듬지도 않은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마치 춤을 추듯 도열해서 들보와 서까래의 무게를 묵묵히 받치는 힘찬 기둥이 됐습니다. 직선의 강박을 다 내려놓고 휘면 휜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내버려두듯이 지어낸 건물은 ‘그냥 놔 둠’으로써 파격을 이뤄낸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운사 도솔천의 내원궁. 여기는 선운산의 기골장대한 거대한 바위의 힘찬 뼈대 사이에 아슬아슬 지어진 암자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 하나 없이 웅장한 자연 속에서 스며들듯 지어낸 자그마한 암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도솔암의 맞은편에 우뚝 솟은 천마봉입니다. 도솔암에서 걸어서 30분이면 넉넉한 자리. 천마봉의 깎아지른 벼랑 앞에서 암봉을 병풍으로 둘러치고 있는 내원궁을 내려다본다면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선운(禪雲)’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 아래 선운사만 봐서는, 거기에 이르게 피어난 동백만 만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 같은 의미를 말입니다.
# 선계와 속계의 경계에 세운 정자…두암초당 전북 고창에는 인천강이 있다. 선운사의 들머리 쪽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 물길이다. 주진천이라고도 혹은 장수강이라고도 하지만, 고창사람들이 그 물길을 일러 ‘풍천’이라 부른다. 고창의 명물 ‘풍천 장어’의 이름도 여기서 나왔다. 본디 풍천이란 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나 바람을 불러들이는 지형을 이르는 말이지만, 고창사람들은 인천강의 본디 이름이 ‘풍천’이었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풍천 장어의 ‘풍천’을 독점적인 제 것으로 쓰고자 함이리라. 아무튼 인천강의 물을 끼고 있는 반암마을 일대는 기암들이 즐비하다. 병바위와 소반바위, 두락암, 할매바위, 탕건바위…. 그중 기이하게 생긴 것이 병바위다. 대취한 신선이 상을 걷어차서 술병이 거꾸로 꽂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인데 그것 참 희한하게 생겼다. 거꾸로 처박힌 술병처럼 보였다가 어찌 보면 사람 옆얼굴을 꼭 닮았다. 병바위를 두고 반암마을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옆얼굴을 꼭 닮았다”고 한다. 구암리 마을회관 앞에 서니 그것 참…. 백 배 공감이다. 눈썹 흰 노(老) 대통령의 옆얼굴 그대로다. 사람 얼굴 형상의 바위는 드물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의 얼굴을 닮은, 그것도 현대사의 인물과 닮은 바위는 여기 말고는 없지 싶다. 병바위 옆에는 그 술병을 올려놓았다는 소반바위가 있고, 그 뒤쪽의 아산초등학교 교정을 내려다보는 두락암이 있다. 두락(斗洛). 바위형상이 꼭 곡식을 재는 말(斗)처럼 생겼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수직의 마름모꼴로 우뚝 서 있는 두락암은 크기와 생김새도 예사롭지 않지만, 수직 암벽의 중간쯤에 허공에 매달아 지은 옛 정자가 더 기이하다. 정자가 내건 현판은 ‘두암초당’이다. 수직의 바위 허리쯤의 움푹 파인 자리에다 기둥을 놓고 처마를 들이고 기와를 올렸는데, 정자의 반은 바위 안에, 나머지 반은 허공에 다리를 받쳐 세워놓은 형국이다. 정자에는 한 칸짜리 방을 들이고 방을 둘러 두 칸의 마루를 놓았다. 누마루에 앉아서 허공에 두 발을 늘어뜨리고 있노라니 여기가 바로 신선의 자리다. 선계와 속계의 경계. 무릇 도를 닦아 신선이 되고자 한다면 딱 맞을 자리다. ‘두암초당’의 주인은 조선 중기의 변성온, 성진 형제다. 하서 김인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퇴계와 교유했던 변성온은 인품으로나 학덕으로 보나 널리 존경받던 선비였다. 그는 배운 것을 늘 실천하려 했고, 문필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며 늘 백성을 앞세웠다. 이런 사람됨을 두고 퇴계는 “1만 개의 향다발을 묶어놓은 듯하다”고 평했다. 편액으로 내걸린 두암초당의 ‘두암(斗巖)’도 곡식을 재는 말(斗)과 같이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마루에 걸린 ‘고산경행(高山景行)’ 편액도 같은 의미로 읽힌다. 시경에서 따온 이 글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산과 사람이 걸어가는 큰길’이라는 뜻. 무릇 세상을 이끄는 이들이 높은 산과 큰길처럼 공명정대하게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천강의 물길을 따라 기암들을 찾아가는 여정은 소매를 끌어 권할 만하다. 고창을 찾는 이들이 죄다 선운사와 고창읍성, 그리고 학원농장의 보리밭을 찾아가는 통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강변에 수석처럼 우뚝 솟은 바위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썩 괜찮다. 내친 김에 구암리 쪽에서 선운산 동쪽 사면으로 붙어서 구황봉 아래 선바위와 병풍바위, 안장바위, 탕건바위까지 남들이 보지 않은 기암의 절경을 두루 만나고 오는 건 ‘선택’사항이다.
# 휘어진 나무만 골라서 기둥으로 삼다…홍의재 무장면 덕림리에는 자그마한 연못을 앞에 둔 서원 겸 사우 ‘용오정사’가 있다. 용오정사는 담을 두르고 모아 지은 세 채의 건물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담 안에는 구한말 국치를 당하자 고향에 은둔했던 선비 정관원을 기리는 사우 ‘덕림사’와 강당 ‘경의당’, 그리고 기숙사격인 ‘홍의재’가 있다. 이 중에서 대번에 눈길을 휘어잡는 건물이 바로 홍의재다. 홍의재는 춤을 춘다. 구불구불 휘어져 자란 나무를 가져다가 싹둑 잘라서 그대로 기둥으로 삼았다. 휘어져도 보통 휘어진 게 아니다. 어쩌다 기둥 하나가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을 지탱하며 힘을 받는 모든 기둥이 다 그렇다. 이런 기둥이 들보와 서까래를 지탱하고 있지만, 건물은 놀랍게도 단정하고 반듯하다. 일부러 굽은 나무를 베어다 쓴 게 틀림없지만, 그게 ‘아무것이나’ 가져다 세운 것이라면 이렇듯 단단하게 1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없었으리라. 모르긴 해도 기둥의 곡선과 힘의 중심을 다 계산에 넣고 셈을 헤아려 지은 것이겠다. 직선의 강박을 다 버리고, 주춧돌 위에다 휘어져 자라는 나무를 그대로 세워 넣은 솜씨라니…. 용오정사는 대목장 유익서의 솜씨다. 전북 정읍에 심묘한 솜씨로 증산교 계열의 보천교의 본부였던 ‘차천자궁’을 지었다던 그 목수다. 차천자궁이 소유권 분쟁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그 솜씨를 아까워한 사람들은 집을 헐어버리는 대신 뜯어서 옮겼다. 하나는 뜯겨서 서울 조계사의 법당이 됐고, 다른 하나는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됐다. 지난 2012년 겨울 정읍 내장사의 화재로 잿더미가 돼버린 대웅전이 바로 유익서 대목장의 솜씨로 지은 차천자궁의 건물을 뜯어다 세운 것이었다. 그가 용오정사를 지은 것은 유익서가 선비 정관원과 인근 동네 사람이라는 인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하필 홍의재의 기둥에 굽은 나무를 가져다 썼을까. 용오정사를 지키고 있는 증손 정계석 씨의 설명이 이렇다. “어르신의 호가 용오(龍塢)였다. 용(龍)처럼 힘찬 기상을 가진 분이셨다. 일제 침략에 의병을 모집해 항일 투쟁에 앞섰다가 고종이 승하한 뒤 마을 뒷산에 단을 세우고 통곡으로 날을 보내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대목장은 아마도 홍의재 기둥으로 용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신 게 아닌가 싶다.” # 빼어난 글씨와 파격의 벽화…경의당과 덕림사
홍의재 앞에는 강당으로 쓰이던 경의당이 있다. 마루 한쪽에 벽 없이 사방을 들어 올리는 문으로 처리해 풍경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은 솜씨가 제법 볼 만하다. 경의당의 들보와 기둥에는 편액과 주련이 주렁주렁 걸려 있다. ‘불가무차소(不可無此所)’란 글은 추사의 스승이었던 옹강방의 솜씨다. 아마도 명나라의 시인 육방호가 대장부의 기개를 다룬 시의 한 구절인 ‘대장부불가무차기절(大丈夫不可無此氣節·대장부에게 이런 기개와 절도가 없을 수 없다)’에서 따온 것이겠다. ‘구수산방(求壽山房)’이란 글은 추사의 것이고, ‘금성옥진(金聲玉振)’은 의친왕 이강이 쓴 것이다. 특히 고종의 다섯 째 아들 이강이 남긴 단아한 행서의 글씨는 한눈에도 ‘거 참 잘 썼다’는 탄성이 나온다. 사당인 덕림사는 도무지 사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독특하다. 절집을 주로 지었던 대목장이 솜씨와 기교를 부려 갖가지 장식과 화려한 단청으로 건물 전체를 치장했는데 특히 사당으로 드는 문을 치장한 난간과 조각의 정교함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 사당 외벽에는 절집의 탱화와 유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파격을 만난다. 벽에는 연꽃과 모란, 신선의 그림과 함께 외제 ‘클래식카’가 달려가는 모습과 유럽 어디쯤의 별장을 그려낸 그림이 여태 한 번도 덧칠을 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절집이나 사당의 벽화 중에 자동차와 별장을 그린 건 아마도 이곳이 거의 유일하리라. 이렇듯 용오정사에서는 100여 년 전의 대목장이 주인을 기려 지은 건물 곳곳에 보물찾기를 하듯 숨겨놓은 것들을 만나게 된다. 압제의 시대에 굳고 단단한 삶을 살았던 이를 기리는 집을 지으면서도 진흙을 주무르듯 가볍게 파격을 넘나들었던 대목장의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된다. # 구름 속에서 참선하는 자리…도솔천 내원궁 고창의 선운사는 늘 발길로 붐비는 곳이다. 특히 이즈음처럼 동백꽃 피는 봄에는 더 그렇다. 선운사 동백은 늦다. 보통 3월 중순이 훨씬 넘어서야 꽃을 피우기 시작해 봄의 끝자락에나 만개한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남 강진의 봄 (0) | 2014.03.12 |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4 (0) | 2014.03.09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10 (0) | 2014.03.02 |
| 薯童의 꿈 (0) | 2014.02.26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4 (0) | 201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