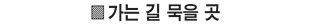|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그곳에 도착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물녘 강변에서 메콩강을 바라보고 섰는데, 강가에 혼자 앉아 있던 독일 청년이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왜 라오스에 왔니?” 라오스는 태국처럼 역사도 깊지 않고 캄보디아처럼 세계적인 종교유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베트남처럼 역동적인 맛도 없고, 필리핀처럼 아름다운 남국의 바다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라오스일까요. 일주일 예정으로 왔다가 한 달째 라오스를 여행하고 있다는 그는 그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답 대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가 씨익 하고 웃었습니다. 청년과 나란히 앉아 해가 다 질 때까지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무는 강에 배를 묶어둔 어부가 마중 나온 맨발의 두 아들과 물고기가 담긴 광주리를 들고 붉게 불든 노을 속을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마법 같은 평화로움은 아마도 평생을 하루처럼 사는 이들의 단순한 삶이 만들어내는 듯했습니다. 거기서 시간은 느리게 갔고, 아무도 바삐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라오스를 여행하는 내내 가장 자주 맞닥뜨렸던 건 이런 완벽한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우리로 치자면 경주와 비슷한 루앙프라방, 그리고 정선 동강의 풍경을 빼닮은 방비엥을 오가며 도처에서 푸른 폭포와 물로 가득 찬 동굴 같은 빼어난 풍경을 만났습니다만, 이런 자연보다 매혹적이었던 건 거기 깃들여 사는 이들의 단순한 삶이 만들어낸 선량한 눈빛과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라오스냐’는 물음의 답은 더 이상 필요 없을 듯합니다.
# 나눔을 다시 나누는 풍경 앞에서 옷깃을 여미다 라오스에 대해 말하자면 아무래도 ‘탁발(탁밧)’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순서겠다. 라오스의 푸른 새벽을 여는 것은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다. 수도인 비엔티안에서도, 제2의 도시라는 루앙프라방에서도, 관광지인 방비엥에서도 그렇다. 주황빛 승복을 입은 탁발승의 행렬을 수도 비엔티안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의 고도(古都) 루앙프라방의 골목에서 맞닥뜨렸다. 루앙프라방의 매혹적인 풍경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사원과 식민지풍의 옛 건물들이 늘어선 루앙프라방의 골목은 마치 복잡한 혈관과도 같았다. 오전 6시쯤 길게는 서른 명쯤, 짧게는 열댓 명쯤 되는 스님들의 행렬이 곳곳에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나타났다. 길가에는 갓 지은 새벽밥을 담은 광주리를 앞에 둔 주민들이 맨발로 무릎을 꿇고 스님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길가의 주민들은 양철로 된 스님의 발우에 일일이 밥을 떼어 넣어주었다. 하나의 행렬이 끝나고 나면 잠시 뒤 다른 행렬이 유연하게 뒤를 이었다. 골목 이쪽에서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나타났다 반대편으로 사라졌고, 맞은편 골목을 돌아나온 행렬은 이내 다른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몽환적이었다. 무슨 원칙이 있는지 행렬은 절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탁발승의 행렬은 수많은 발을 가진 지네처럼, 혹은 혈관을 도는 피톨처럼 도시를 순환했다. 스님들의 발우는 금세 가득 찼다. 이제 스님들의 차례였다. 발우 속의 음식을 떼어내서는 꾀죄죄한 행색의 아이들이 앞에 놓은 빈 바구니에 채워주기 시작했다. 빈 바구니에 여러 스님의 손의 들고나면서 채워진 밥은 가난한 한 가족의 하루 식량쯤은 넉넉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았다. 나눔이 다시 나눔으로, 공덕이 다시 공덕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경건했다. 그들이 나누는 건 단지 밥이 아니었다. 손에서 손으로 나눠지는 밥은 희망이자,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정신과도 같은 것이었다. 온기가 남아 있는 밥과 희망과 정신으로 그곳에서는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다. 제 것을 나눠주기는커녕 늘 다른 이들의 것을 탐하는 세상에서 온 여행자들에게 탁발 행렬은 ‘신기한 구경거리’에서 감동으로, 다시 반성으로 옮아갔고 이어 종래에는 이런 의문으로 다가왔다. ‘떠나온 도시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 라오스에서 만난 ‘낯선 가난’의 풍경들 이번에는 라오스의 ‘낯선 가난’에 대해 말할 차례다. 라오스는 유엔이 정한 최빈국이다.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데 이 나라의 가난이 참 낯설다. 우리가 오래전에 건너왔던 ‘가난의 풍경’이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다닥다닥 붙은 옹색한 집, 깃발처럼 내걸린 누추한 빨래. 게으른 어른과 구걸하는 아이들, 도처에서 만나는 분노 혹은 체념의 표정.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악다구니…. 그러나 라오스에서 만난 가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남한 땅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에 인구래야 690만 명. 그러니 가난해도 다들 널찍널찍하게 산다. 넓은 논에서 거둬들인 쌀은 모자라지 않고, 그마저 없다 해도 종교에 의탁해 서로 나누면 그만일 뿐이다. 라오스에 머문 며칠 동안 구걸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목격하지 못했다.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고, 현실에 좌절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느린 시간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또 오늘과 똑같을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아직 욕망이 침범하지 않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 그게 어쩌면 ‘가난이 라오스 사람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철없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그러니 거기서 혹여 가난하다고, 또 누추하다고 라오스 사람들을 낮춰 보지 말 일이다. 그들은 욕망의 도시에서 온 여행자보다 훨씬 더 맑은 눈빛을 갖고 있고, 근사한 미소까지도 지을 줄 아니 말이다. 여행자를 매료시키는 건 대개 ‘제가 갖지 못한 것’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라오스를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매혹될 가능성이 높은 건 라오스 사람들의 느리고 유순한 삶의 방식이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달라붙은 가난은 여간해서는 쉽사리 떼어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무책임한 여행자의 이기적인 생각이란 타박을 감수하고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 여겨졌다.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삶의 방식이 그곳에서라도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수도 비엔티안의 도로를 석권한 국산 승합차를 보며 대당 판매 순익을 따지거나 뿌듯해하기보다 ‘우리가 판 차들이 그들에게 쓸모 있게 소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루앙프라방,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도시 다시 루앙프라방 얘기. 루앙프라방은 800년 동안 라오스 최대 통일왕국인 란상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니 우리로 치자면 경주 같은 도시인 셈이다. 수도 비엔티안에서 북쪽으로 350㎞. 비행기로는 40분 남짓이지만, 험준한 산자락을 넘어 버스로 이동하자면 10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다. 그럼에도 루앙프라방은 라오스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거쳐 간다. 란상왕국 시대에 화려한 사원으로 가득 찼던 루앙프라방은 황금 불상과 에메랄드 불상을 안치했을 정도로 번성했던 모양인데, 태국의 잦은 침략과 곧 이은 프랑스의 식민통치로 쇠락을 거듭했다. 태국의 침략으로 에메랄드 불상은 탈취당했고, 독립 후 베트남전쟁에 휘말리면서 들어선 공산정권의 종교 탄압도 이어졌다.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왓 시엥통 사원과 왕궁박물관에서는 종교건축물 특유의 섬세함과 우아함이 느껴졌지만, 시멘트로 덕지덕지 보수한 다른 유적들은 실망스러운 쪽에 가까웠다. 나라 사정이 옛 불교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낼 만큼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하기야 거대하고 사찰이 기념비처럼 남아있다한들 불법의 정신이 무너졌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사원의 외양은 그럴지언정 사원이 상징하는 정신은 주민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살아 자리 잡고 있다. 이른 새벽 루앙프라방의 탁발 행렬은 그걸 증명하고도 남았다. 루앙프라방은 어찌 보면 서구 여행자들이 점령한 도시처럼 보였다. 식민지풍 건물마다 늘어선 게스트하우스와 커피숍, 카페는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서구 여행자들을 위해 다들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밤이면 도심 한복판에 관광객을 겨냥한 야시장이 섰다. 관광객들에게 상권의 주도권을 넘겨준 동남아시아 관광지의 야시장 풍경은 익숙하다. 그런데 루앙프라방 야시장의 분위기가 좀 의외인 것은 돈 많은 외국인들을 겨냥한 바가지 상혼도, 악다구니 같은 호객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유흥가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새벽시장에서도, 야시장의 노점에서도 좌판을 얌전히 펼친 상인들은 오히려 손님들 앞에서 수줍음을 탔다. 흥정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물러서버리는가 하면, 거스름돈을 자주 헷갈리는 루앙프라방 상인들은 장사에는 도통 소질이 없어 보였다. 느린 시간에 감염된 관광객과 물건 파는 일에 익숙지 않은 라오스 상인들. 이런 야시장 풍경은 오직 루앙프라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 동화적인 푸른 물빛을 품은 꽝시폭포 라오스에는 ‘없는 것’이 많다. 동전, 철도, 백화점, 대형마트, 우체부…. 라오스에 또 없는 것이 바다다. 라오스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내륙국가다. 다른 건 몰라도 ‘바다가 없다’는 건 여행지로서는 적잖은 핸디캡이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와 함께하는 우리 산하 기행_22 (0) | 2013.05.26 |
|---|---|
|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_11 (0) | 2013.05.25 |
| 楚辭_12 (0) | 2013.05.22 |
| 덕유산 철쭉산행&오토캠핑 (0) | 2013.05.19 |
| 석탄일에 만나는 괴산 (0) | 201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