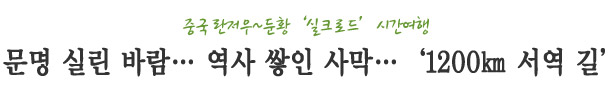 |
거기서는 한때 사람이 만들었던 것도 이제 자연의 일부가 돼서 마치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란저우(蘭州)와 둔황(敦煌)을 잇는 실크로드. 이 길 위에서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무역이 이뤄졌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났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만난 일곱까지 색을 띠고 있다는 치차이(七彩)산과 바람이 불면 모래소리가 들린다는 밍사(鳴沙)산의 모습은 자연이 저 스스로 만들어낸 경이였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풍경 속에 세워진 만리장성 서쪽 끝의 천하제일웅관이나 부처를 찾기 위해 승려들이 판 막고굴은 사람의 손길로 일으켜진 것이었으되 오랜 시간이 흘러 그것조차 마치 자연이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상인들의 행렬로 가장 번성했던 곳이고 가장 사람의 발길로 분주했던 곳. 그러나 시간과 바람으로 풍화가 거듭되면서 실크로드의 도시들은 발길이 끊기고 화려한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람이 만들었던 실크로드의 자취들은 그것 그대로 자연의 일부분이 됐고 이제 다시 그 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간쑤(甘肅)성의 성도(省都) 란저우가 실크로드의 시작점입니다. 란저우는 1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로 시안(西安)과 서역을 연결하는 입구이자 황허(黃河)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란저우에서 둔황까지는 총 1200㎞. 야간열차를 타고 이동해도 꼬박 16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길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과 모래사막 그리고 병풍처럼 서 있는 산맥을 지나갑니다. 치차이산, 밍사산, 막고굴, 천하제일웅관 등 자연이 만든 것과 사람이 만들어 자연이 된 유물들이 이 길 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행로를 ‘편안한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찾는 이들이 적은 탓인지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쇼핑센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대자연과 오래된 시간, 그리고 사람의 자취가 자연과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란저우와 둔황을 잇는 실크로드의 위에 꼭 서보시길 권합니다.
란저우(蘭州)에서 둔황(敦煌)까지 1200㎞를 차량편으로 이동했던 이번 여행에서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동하는 시간만 수십 시간에 달했다. 4일간 란저우에서 둔황까지는 자동차로 이동하며 둘러봤고, 마지막 날에는 둔황에서 란저우까지 야간열차를 타고 다시 되돌아왔다. 이런 코스 덕택에 실크로드 여정에서 눈과 마음에 담았던 많은 유적과 자연 경관들을 야간열차 안에서 다시 한 번 꺼내보며 음미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 야간열차를 타고 란저우로 복귀하는 열차 안에서 사막 위로 뜬 붉은 달을 보며 명소의 감흥을 되새기다 침대칸에 누워 한숨 자고 일어나보니 16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 형형색색 신비의 ‘치차이산’ 실크로드 여행에서 만난 풍경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치차이(七彩)산이었다. 중국 간쑤(甘肅)성 장예(張掖)시에서 차로 30∼40분 남짓. 장예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꼽히는 치차이산은 510㎞에 걸쳐 알록달록한 색깔의 산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 마치 거대한 무지개떡이 굳어 산이 된 것처럼 산은 층층이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있어도 좀체로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설고 생소하다.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하다. 산이 어찌 이런 색을 갖고 있을까. 오랜 기간 지질운동으로 인해 붉은색 사암이 풍화와 퇴적작용 등으로 단층화돼 서로 다른 색깔을 띠게 됐기 때문이란다. 치차이산이라는 이름도 다채로운 색을 띤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치차이산의 형형색색한 모습이 더욱 선명해져 마치 바위산에 무지개 수를 놓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 볕이 좋은 날이라면 감흥은 더해진다. 치차이산에는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한다. 버스가 치차이산의 주요 코스에 관광객들을 데려다 주는데, 등산의 개념이 아니라 구경한다는 느낌에 가깝다. 애써 산에 오를 필요없이 버스를 타고 가다 내려서 5∼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 가장 높은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탁 트인 전망을 만나게 된다. 치차이산은 아직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코스로 개발되지 않아 영어나 다른 언어의 가이드는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 설명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당하는 이런 풍경 앞에서는 말이 무슨 소용 있을까. 다만 한 가지, 치차이산의 다양한 색깔 중 흰색은 소금성분이고, 이를 통해 치차이산이 과거에 바다였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가자. 그 거대한 곳이 과거에 바다였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차이산에서의 감동은 배가 된다.
# 바람·모래·달 밍사산과 웨야취안 고운 입자의 모래로 이뤄진 산인 밍사(鳴沙)산은 둔황을 대표하는 명소다. 둔황 남쪽으로 5㎞ 떨어진 곳에 뾰족하게 솟아 있으며 남북 20㎞, 동서 40㎞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산이다. 사막의 한가운데에 솟아 있으며 바람이 불어 모래가 날릴 때는 마치 관현악을 연주하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 ‘모래가 운다’는 뜻의 이름이 붙여졌다. 거센 모래바람이 불 때면 산 전체가 큰 소리로 우는 듯하다는데, 모래 범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밍사산에 당도한 날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밍사산에 오를 때는 입구 쪽에서 주는 신발 토시를 꼭 착용해야 한다. 모래의 입자가 너무 고와 한 번 옷에 들어가면 빨아도 3년 동안 모래가 나온다는 믿을 수 없는 얘기. 토시 없이는 신발이나 바지 틈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밑창에 미끄럼방지가 있는 운동화는 오히려 밍사산을 오를 때 걸리적거린다. 마찰이 생기지 않는 신발 토시나 맨발로 마치 밀어 올리듯이 밍사산을 올라야 좀 더 수월하게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다. 생각보다 꼭대기까지 오르는 게 쉽지 않다. 밍사산을 오르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밍사산 아래쪽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데 낙타를 타고 줄줄이 이어 모래성을 오르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장관이고, 직접 타보면 마치 실크로드를 통해 무역을 하러 가던 상인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다. 모래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장관이 펼쳐진다. 먼저 눈길을 붙잡는 건 밍사산 아래 쪽에 있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는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 웨야취안(月牙泉)이란 이름이 붙었다. 긴 쪽의 너비는 150m 정도고 폭은 50m 정도. 웨야취안은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로 한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실크로드 상인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다. 지금은 웨야취안 옆에 누각을 세워 사막의 오아시스에 운치를 더한다. 밍사산과 웨야취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조다. 특히 밍사산 꼭대기에서의 일몰은 천하절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감동적이다. 모래산 위에 앉아 태양의 열로 달궈진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 밍사산에 오르기 위해 했던 수고를 잊게 해 준다. #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 ‘막고굴’ 둔황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25㎞ 떨어진 곳, 황량한 산으로 온통 둘러싸인 자리에 무려 700개가 넘는, 사람이 만든 굴이 있다. 그게 바로 막고굴이다. 막고굴은 366년 승려 약준이 밍사산과 싼웨이(三危)산에 이상한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석벽을 파서 굴을 만들기 시작한 게 시초라고 한다. 그로부터 14세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승려와 조각가, 화가, 석공, 목공 등이 드나들면서 굴을 팠고, 그렇게 파게 된 크고 작은 굴들이 735개에 이른다. 굴 안에는 부처를 기리는 불상과 벽화, 조각들로 가득하다. 굴을 파고 그 안에 그림을 그리고 불상을 세우며 사후 세계와 현세의 복을 빌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다 보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진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이런 고행을 가능하도록 했을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만 약탈로 인해 막고굴에서 발견된 유물 수만 점이 해외로 유출돼 10여 개국의 박물관과 도서관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단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상과 벽화, 조각들은 수천 년 전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자국의 유적과 문화재를 아끼는 중국 정부의 심사숙고의 집약체가 막고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고굴을 대하는 중국의 방식은 유난스러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또 엄격했다. 하루에 받는 관광객 숫자도 제한돼 있고, 관광객들도 1시간에 5∼6개 정도의 공개된 굴만 볼 수 있다. 공개되지 않은 굴들은 영원히 열리지 않게 해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게 해 그 안에 있는 유적들을 보존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관광객을 위해 한국어나 영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있지만 가이드의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손전등 하나다. 벽화나 불상의 채색한 부분에 빛이 많이 닿으면 바래지고 변색된다는 이유로 조명조차 막고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유별난 보호와 엄격한 통제가 오히려 더 신비로움을 더해준다. 막고굴의 벽화가 특히 인상적인 건 간혹 등장하는 고구려나 백제, 신라인들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 스스로 자연이 된 ‘천하제일웅관’ 간쑤성의 자위관(嘉?關)은 고대 실크로드의 교통요지였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발해만에 면한 산하이관(山海關)이라면, 자위관은 만리장성의 서쪽의 성루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지형을 활용한 전략이 돋보이는 곳이다. 자위관이 위치한 만리장성은 진시황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걸 진시황이 이어 완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자위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리장성 성채 안에 위치한 박물관에는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물건들과 전쟁기념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 때는 실크로드의 교통 요지이며 당당한 군사적 요충지였지만 지금은 자위관 성루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어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분까지 들 정도다. 자위관 입구의 ‘천하웅관(天下雄關)’이라 새겨진 거대한 비석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 비석 때문에 오히려 더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위관이 인상적인 건 오랜 시간을 건너온 장엄한 건물이 마치 치차이산이나 밍사산처럼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자연의 일부가 돼서 풍경 속에 녹아있다는 얘기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도 지친 기색 없이 수비를 담당하는 백전노장처럼 자위관 또한 그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을이 더 좋은 "제주의 푸른밤" (0) | 2013.10.04 |
|---|---|
| 시와 함께하는 우리 산하 기행_26 (0) | 2013.09.30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17 (0) | 2013.09.24 |
| 황교익의 味食生活_37 (0) | 2013.09.23 |
| 남도해양 관광열차 (0) | 2013.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