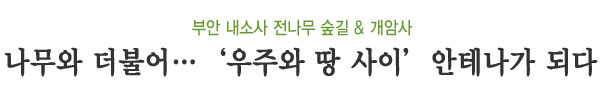 |
신은 공평하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라도 전북 부안에 가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부안은 아름다운 바다와 뛰어난 자태의 산을 함께 받은 ‘천혜’의 땅이다. 오죽하면 변산반도를 ‘서해의 진주’라고 불렀을까. 그 이름을 뒷받침하듯 변산반도는 통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지도를 펴놓고 언뜻 훑어봐도 격포해수욕장, 상록해수욕장 등 해수욕장이 즐비하고 채석강, 적벽강 등 해안의 명소와 내소사, 개암사, 월명암 등 고찰, 암자들이 보석처럼 박혀있다. 바다 역시 풍요롭다. 지금은 전설처럼 돼버렸지만, 변산반도 앞 위도까지 아우르는 칠산바다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연평어장과 함께 우리나라 2대 조기어장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의 이야기다. 파시로 흥청거렸던 위도에서는 지금도 정월 초면 위도 띠뱃놀이가 펼쳐지고, 격포에는 서해의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수성당이 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여행지로 부안을 찾아간다.
#내소사 전나무숲길 = 부안 땅에 들자마자 내소사부터 찾은 이유는 청청한 전나무 숲이 그리워서였다. 한겨울의 찬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시퍼런 직립 전나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만나고 싶었다. 비겁과 굴신(屈身)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꿋꿋한 기상에서 한 해를 당당하게 걸어갈 용기를 얻고 싶었다. 일주문을 지나면서 번잡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당혹스러울 정도의 적막이 흐른다. 전나무 숲은 일주문 바로 앞부터 이어진다. 전나무들은 주변이 무채색으로 퇴색할수록 암청(暗淸)의 무게를 더해간다. 계절의 변화에 굴종하지 않는 고집은, 눈이라도 내리면 더욱 푸르게 빛난다.
온몸에 힘을 빼고, 허세의 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찾아 천천히 걷는다. ‘내가 누군데…’ 하는 도시에서의 허세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세상은 허세를 감싸줄 만큼 녹록한 곳이 아니다. 잠깐 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본다. 앞으로 가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거기 있다. 스스로 나무와 더불어 안테나가 된다. 우주의 기를 받아 땅에 전하고, 땅이 내어주는 기를 받아 우주에 전한다. 심신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다. 걷다 보니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다. 몇 그루는 우듬지가 잘린 채 바람을 맞고 있다. 여러 해 전 이곳을 지난 태풍이 저지른 짓이다. 안온하던 숲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나무들은 하나 둘 부러지고 쓰러졌을 것이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다. 느닷없이 들이친 바람에 넘어지고 다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원망이나 한탄을 하기보다는 추스르고 일어나 걸어야 한다. 겨울을 나지 않고 키를 키우는 나무가 있을까.
10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이 느티나무의 짝은 일주문 밖에 서있다. 이 나무가 할아버지 나무고 밖에 있는 나무가 할머니 나무다.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면 이 나무 앞에 내소사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당산제를 지낸다. 허리 굽은 소나무와 겸손해보일 정도로 작은 탑과도 눈인사를 나눈다. 내소사는 누가 봐도 빼어난 절이다. 그중에서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은 대웅전 꽃살문. 빗국화꽃살문, 빗모란연꽃살문, 솟을모란연꽃살문, 소을연꽃살문 등의 이름을 가진 꽃살문들이 살아있는 듯 생생하다. 400년을 견디며 육탈을 거듭한 시간의 뼈들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마침 법회라도 있는지 가사장삼을 갖춘 스님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간다. 조금 뒤 경내에 울려 퍼지는 청아한 독경 소리. 속세에서 묻히고 들어온 마음의 먼지가 목탁소리마다 툭툭 떨어진다. 대웅전 앞 돌 위에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 겨울아침이 춥지만은 않다.
이화우(梨花雨)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교과서에도 실린, ‘이화우’로 시작하는 이 시를 쓴 이가 이매창이다. 기생이었지만, 한 남자를 절절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서른여덟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련의 여인. 사람은 떠났어도 시는 남아 여전히 세상을 울리고 있다. 매창의 묘는 깔끔하게 잘 가꿔놓았다. 가느다란 겨울 햇살이 안온하게 감싸고 있어 마음이 푸근해진다. 공원 곳곳에는 그녀가 쓴 시와, 그녀를 기리는 시를 적은 시비들이 서 있다. 시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먼저 떠난 이와 긴 이야기를 나눈다. 개암사로 올라가는 길은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한겨울인데도 냇물이 돌돌 소리를 내며 흐르고, 길옆의 차밭은 깊고 푸르다. 조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불쑥 나타나는 한 쌍의 바위(우금암)와 대웅전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 내소사에서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절의 풍치로만 놓고 본다면 이 절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대웅보전, 응진전, 지장전… 옹골차게 들어선 절집들을 한 바퀴 돈 뒤 내려오다가 마당에서 늙은 매화나무를 만났다. 잔가지에 작은 꽃망울들이 점점 맺혀있다. 400년 된 나무라는 안내문에 눈길이 머문다. 400년이라… 매창이 떠난 지 400년 조금 넘었으니 서로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매창의 자태가 어떠하더이까?” 묻고 싶지만 부질없다는 생각에 돌아섰다. 평생 한 남자를 그리워하다 떠난 여인 매창. 그녀는 끝내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거나 사랑에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하지만 어찌 사랑이 소유나 종결의 대상이 되랴. 결국 가슴에서 활짝 꽃피웠을 것을. #그밖에 가볼 만한 곳 = 부안에 가면 채석강(彩石江)에 들르지 않을 수 없다. 채석강은 변산반도 맨 서쪽 격포에 있는 1.5㎞의 해안절벽이다. 약 7000만 년 전에 형성된 퇴적암으로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올린 것처럼 보인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즐겨 찾던 채석강과 비슷한 경관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가까운 곳에 적벽강과 수성당이 있다. 또 하나 부안의 명소는 곰소염전이다. 소금을 보통 3월 말에서 10월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조금 쓸쓸하지만, 염전 사잇길로 걷는 맛은 색다르다. 저물녘에는 소금창고 너머로 그림 같은 석양이 펼쳐진다. 요즘은 인근에 있는 곰소젓갈단지가 더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맑은 날이라면 마실길 제4코스에 있는 솔섬도 찾아가 볼만 하다. 서해에서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 소나무가 서있는 작은 섬 사이로 지는 해가 황홀할 만큼 아름답다.
내소사는 원래 거꾸로인 소래사… ‘다시 태어나도 오고 싶다’ 뜻 18세 기생 매창, 46세 유부남과 사랑… 절절한 詩 교과서에 실려 능가산 내소사(來蘇寺)는 백제 무왕 34년(633년)에 창건된 절이다. 원래 이름은 소래사(蘇來寺)였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도 이 절을 찾아오고 싶다는 뜻이다.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건물이 불타버려서 인조 때에 중창했다. 빼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대웅보전도 그때 세워졌다. 대웅보전과 법당 안의 후불벽화, 꽃살문 외에도 고려동종, 법화경 절본사본, 영산회괘불탱 등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내소사에는 숱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특히 전설이 단순히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웅보전을 중수할 때 이야기다. 어찌된 일인지 대목은 3년 동안 목재를 베어오고 다듬는 일만 계속하였다. 집은 지을 생각도 없이 기둥, 서까래와 나무토막만 자꾸 깎아 놓자 어느 날 사미승이 장난삼아 나무토막 하나를 슬쩍 감췄다. 나무 깎기가 끝나는 날 나무토막을 세어본 대목은 하나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주지 스님에게 자신은 대웅전을 지을 자격이 못된다고 집짓기를 고사했다. 주지스님의 권유로 대웅전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끝내 나무토막 하나가 빠진 채 완성되었다.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호기심을 경계하기 위해 내려오는 전설일 것이다. 하지만 교훈보다 재미있는 것은 전설의 ‘증거’들을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대웅보전 천장에는 실제로 나무토막이 빠져 구멍만 남은 자리가 있다.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곳 근처다. 오른쪽 벽 한 곳에는 단청이 비어있다. 대웅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상주하는 ‘법당보살’에게 설명을 청하면 자세히 이야기해준다. 개암사는 기원전 282년 변한의 문왕이 진한과 마한의 난을 피해 이곳에 도성을 쌓은 뒤 전각을 짓고 동쪽을 묘암, 서쪽을 개암이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보물 제29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조선 중기 대표적 건물이다. 높이가 13m가 넘는 영산회괘불탱은 보물 1269호로 지정됐다. 매창은 1573년 부안현의 아전 이탕종의 서녀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면서 열여섯에 기적(妓籍)에 이름을 올렸다. 평범한 기생으로 살다갔을지도 모르는 매창의 일생을 파란만장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었다. 기생이 된 지 2년, 열여덟 살 되던 해 한양에서 유회경이라는 이가 부안까지 놀러온다. 그는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는 문인이었다. 매창보다 스물여덟 살 많은 유부남이었지만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유회경이 한양으로 돌아간 뒤 바로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는 의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갔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15년 만이었다. 매창은 그 사이에 잠시도 유회경을 놓지 못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구구절절한 시가 바로 그 증거다. 하지만 재회는 짧았다. 부안에 들렀던 유회경이 바로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매창은 그 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3년 뒤인 1610년, 서른여덟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부안의 사당패와 아전들이 외롭게 죽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여 지금의 매창공원에 묻어주었고, 나무꾼들이 벌초를 하며 돌봤다고 한다. 그 뜻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부안 사람들이 매창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개암사에서 발간한 ‘매창집’은 간송문고와 하버드대 도서관 등에 보관돼 있다.
#묵을 곳·먹을 것 = 격포에 대명리조트(063-580-8800)와 바다호텔(063-580-5500), 채석강리조트(063-583-1234) 등이 있다. 해수욕장과 곰소에도 모텔·펜션이 많다. 내소사 입구의 내소식당·산촌식당·전주식당은 산채비빔밥·젓갈백반 등을 내놓고 곰소젓갈단지의 곰소황금밥상은 젓갈백반과 게장백반, 소문난 집은 백합죽·바지락죽·바지락칼국수를 전문으로 한다. 채석강이 있는 격포에서는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북예천 회룡포&삼강주막 (0) | 2015.01.29 |
|---|---|
| 원대리 자작나무숲&곰배령 (0) | 2015.01.21 |
| 번뇌를 벗어라 (0) | 2015.01.08 |
| 아름다운 물 麗水 (0) | 2014.12.04 |
| 色다른 '청주' 길위에 서다 (0) | 2014.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