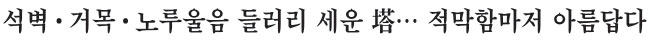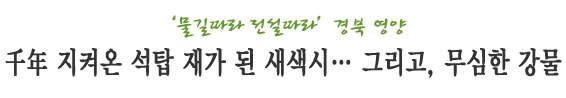 |
돌로 지은 정갈한 탑 하나가 이리도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병풍처럼 펼쳐진 석벽을 끼고 흘러가는 반변천의 물길을 굽어보는 자리. 거기에 1000년 넘게 서 있는 석탑 한 기. 경북 영양의 봉감모전오층석탑입니다. 화려한 기교 없는 담박한 자태. 그 품새 한 번 정갈하기 그지없습니다. 탑 곁에는 잎을 다 떨군 느티나무가 활개치듯 서 있고, 늙은 감나무 가지 끝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연시감 두어 개가 매달려있습니다. 반변천의 물소리가 잦아들면서 주위는 침묵으로 적막한데 기울어가는 초겨울 볕을 받아 탑신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 계절에 경북 영양으로 떠나는 까닭의 팔할 쯤은 이 탑을 보기위함입니다. 국보로서의 값어치 따위는 몰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탑에 얽혀 전해지는 이야기도 변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눈썰미만 좀 있다면, 대번에 눈치채실 것으로 믿습니다. 보탤 것도, 뺄 것도 하나 없는 간결한 탑의 자태가 얼마나 단정한지. 그리고 이런 단정한 탑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얼마나 그윽한 공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영양의 반변천. 중중첩첩(重重疊疊)의 영양 땅을 굽이쳐 흐르는 반변천 물길은 척금대의 곡강팔경(谷江八景)과 옥선대, 비파담, 세심암, 초선대와 같은 명소들을 두루 만들어 냅니다. 그 중 최고의 명승이라면 반변천과 청기천이 만나는 남이포와 선돌 일대입니다. 물길이 Y자로 합수하는 지점에 여러 쪽으로 잘라낸 케이크의 한 조각처럼 예리한 형상을 한 남이포의 모습이나 물 건너 쪽에 우뚝 솟아 그 형상을 바라보는 선바위의 풍경은 비슷한 곳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여기다가 무속의 기운으로 출렁이는 일월산을 보탭니다. 혹 서정주 시인의 첫시집 ‘화사집’의 시 ‘신부’를 아시는지요. 첫날밤을 치르기도 전에 저를 버리고 간 신랑을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재가 돼서 폭삭 무너지고만 신부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신부의 이야기가 바로 일월산에 깃든 것이더군요. 첫날밤을 보내지 못한 ‘황씨부인’을 기리는 사당이 일월산의 어깨쯤에 있었습니다. 사당 앞에다 차를 멈추고 눈 흩뿌리는 산길을 타박타박 걸어 당도한 일월산 일자봉의 정상. 뼈대를 드러낸 겨울 산들이 우우 몰아치는 눈발 속에서 힘차게 산맥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 단정하면서 그윽한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 경북 영양의 반변천 물길을 낀 넓고 야트막한 구릉. 물 건너편에 낮은 병풍처럼 석벽을 둘러친 곳. 거기에 그 탑이 있다. 봉감모전오층석탑. 먼저 그 이름부터 풀어보자. 우선 ‘봉감’이란 탑이 선 마을의 이름. ‘모전(模塼)’이란 ‘전탑을 모방했다’는 뜻이다. 전탑은 ‘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쌓은 탑’을 말한다. 그런데 이 탑은 돌을 흙으로 구운 게 아니라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내 전탑처럼 지었으니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오층석탑’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다섯층을 가진 석탑이란 뜻이다. 벽돌 모양의 돌로 쌓아올린 탑은 화려하지 않다. 높이 11m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탑은 석가탑처럼 유려하지도 않고, 다보탑처럼 귀족적인 품격을 가진 것도 아니다. 봉감모전오층석탑은 날렵한 풍모의 이런 탑과는 미감이 전혀 다르다. 탑의 표정은 어찌 보면 무뚝뚝하다. 하지만 소박하면서 간결한 형태가 더없이 단정하다. 붉은 기가 도는 흑회색의 기운도 자태와 썩 잘 어울린다. 주변은 너른 구릉의 평지가 펼쳐져 있고, 탑 앞쪽에는 까치밥을 매달고 있는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뒤편에는 나뭇잎을 다 떨군 당당한 느티나무 거목이 풍경을 돋보이게 한다. 뒤로 여러 발짝 물러서서 탑을 바라보면 너른 들에 1000년이 넘도록 서 있는 석탑과 몇 그루 나무들, 그리고 반변천 건너로 뼈대를 드러낸 갈모산 석벽의 풍경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그윽한 정취를 빚어낸다. 억새를 두른 반변천의 물길의 흐름은 침묵처럼 유장한데, 먹이를 찾는지 건너편 산자락의 노루 울음소리만 간혹 물을 건너온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통일신라시대 때의 탑의 모습은 어땠을까. 탑의 각 층의 낙수면에는 기와가 곱게 입혀졌을 것이고, 네 귀 끝에는 바람에 뎅그렁거리는 풍경이 매달려있었을 것이었다. 오랜 세월에 기와는 부서졌고, 풍경은 떨어져 나갔지만 이런 장식 하나 없이도 탑은 이렇듯 아름답다. 영양 땅에는 모전탑이 두 기가 더 있다. 우리 땅에 남아있는 모전탑이 모두 10기라는데, 그 중 세 기의 탑이 영양에 있는 셈이다. 봉감모전석탑에 이어 꼽을 수 있는 것이 삼지리모전삼층석탑이다. 산자락의 중턱쯤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탑은 암반 위에 굴러내린 큰 바위를 석탑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석탑을 절묘하게 지어 올렸다. 지금은 이층만 남아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바위로 쓴 기단의 높이가 더해져 제법 웅장한 맛을 낸다. 현리에도 ‘현동모전오층석탑’이 있다. 7m에서 한 치쯤 빠지는 높이라 봉감의 것보다 장대한 맛은 훨씬 덜하지만, 문주석에 새겨진 당초문양이 눈길을 끈다. 기왕 탑 구경을 나섰다면 현일동삼층석탑까지 함께 둘러보자. 31번 국도의 고가도로 아래쪽의 너른 들에 동그마니 놓여있는 이 탑은 몸체에 새겨진 팔부중상과 사천왕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마모되긴 했지만 돋을새김이 아직도 선명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을 보면, 처음 새겨졌을 때는 얼마나 더 정교하고, 빼어났을까.
영양을 굽어 흐르는 반변천은 척금대의 곡강팔경(谷江八景)을 비롯해 옥선대, 비파담, 세심암, 초선대와 같은 명소들을 두루 만들면서 흘러내린다. 그 중에서도 반변천이 가장 절경을 만들어 내는 곳은 남이포와 선바위 일대다. 남이포는 반변천과 창기천의 물길이 한데 모이는 합수(合水)지점이다. 양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합쳐지면서 Y자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두 물길이 합수부의 지형을 예각으로 뾰족하게 깎아내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 지세의 주변을 일컬어 남이포라 부르고, 남이포에서 물 건너편에 송곳처럼 우뚝 솟아있는 기암을 선바위이라고 부른다. 이런 특별한 지형에 전설 한 자락이 어찌 없을까. 남이포에 전설 같은 이야기 한 토막. 남이포 인근 연못에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이 역모를 꾀해 반란을 일으켰단다. 이 소식을 들은 조정에서 용을 토벌하기 위해 급히 남이장군을 파견했다. 남이장군은 치열한 교전 끝에 용 두 마리의 목을 베고는 석벽에다 자신의 초상을 검 끝으로 새겼단다. 그리고 한양 땅을 돌아가려다가 지형을 보니 언젠가 다시 도적의 무리가 일어날 기세라 큰 칼로 산맥을 잘라서 물길을 돌렸다. 선바위가 남이장군이 마지막으로 칼질을 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남이포와 선바위 일대는 일찌감치 풍경을 앞세운 관광지로 개발됐지만, 영양 땅이 워낙 깊다 보니 찾는 이들은 거의 없어 ‘관광지’라 이름 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선바위관광지에는 분재와 수석, 야생화 등을 모아 전시하는 전시장이 있고, 남이포의 뾰족한 끝자락에 세운 정자 남이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석문교도 있다. 바람이 차가운 날만 아니라면, 석문교를 건너 남이포의 물가를 따라 남이정까지의 산책을 추천할 만하다. 반변천의 정취는 영양 땅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이즈음 수량이 줄기는 했지만 영양읍에서도, 반변천 상류의 일월면과 수비면 곳곳에서도 물길이 깎아놓은 석벽의 벼랑과 맑은 물빛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맑은 반변천의 물길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다 보면 학초정, 약천정, 월담헌 같은 시간의 깊이가 묻어나는 영양 땅의 내로라하는 옛 고택과 정자들을 지나고, 초겨울 빈 밭에다 수확을 끝낸 콩대나 고춧대 따위를 쌓아놓고 태우는 평화로운 산촌마을도 지나게 된다. 영양은 한때 인구 7만을 헤아리던 때도 있었으나, 지금 인구는 고작 1만8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서로의 체온’이다. 이들이 어떻게 함께 체온을 나누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영양읍 오일장을 찾아가보면 알 일이다. 남이포 관광지 인근에는 산촌생활박물관도 있다. 산촌생활에서 쓰던 이런저런 것들을 전시해놓은 곳이다. 굳이 박물관을 찾지 않더라도 영양 사람들이 견뎌온 산촌의 삶이 과거에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지명을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영양에서 영덕 쪽으로 넘는 고개가 읍령(泣嶺)이고, 청기면에서 영양읍으로 향하는 고갯길은 행곡령(行哭嶺)이다. 고갯길을 이름에 ‘울 읍(泣)’자나 ‘통곡할 곡(哭)’자를 넣은 연유가 이렇다. 영양 땅을 다스리던 영덕 영해부 관리들의 수탈로 곡식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험한 고갯길을 넘어 동해바다까지 왕복 200리, 멀게는 300리를 오가야 했단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남통영 사량도 (0) | 2012.12.15 |
|---|---|
| 까비르의 詩 (0) | 2012.12.11 |
| 楚辭_01 (0) | 2012.12.09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11 (0) | 2012.12.08 |
| 영화와 함께 떠나는 중국여행_07 (0) | 201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