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물한국사
그리고 만주대룍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까지 연결된다.
우리는 이미 불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쓰인 일연스님의 삼국유사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민족의 시조를 조명하면서 떠도는 민간 전설에 맞추어 기록하여 역사적인 진실을 보지 못한 오류는 책망할 수 있어도 결코 고의적으로 우리의 역사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일연스님의 순수한 기록을 이용하여 우리의 역사를 해하려는 목적에 이용한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
1894년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의 시라토리(白鳥庫吉)라는 자가 일본의 한국침략을 염두에 둔 군부(軍府)의 사주를 받고 엉뚱하게도 단군고(檀君考)를 썼는데, 여기에서 문제의 삼국유사를 인용하여 “단군사적(檀君史籍)은 한국 불교(佛敎)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架空)의 선담(仙譚)을 만든 것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하며 단군의 역사를 일개의 신화(神話)로 결론지어 버렸다.
그 후, 한국을 침략하는데 성공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국토를 영구히 점령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1915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중추원’ 산하에 조선총독과 정무총감들의 직접 지휘 밑에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를 조직한다.
이들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구한 조선의 역사를 일본의 역사보다 짧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한번 점령한 남의 나라 역사를 마구 조작하여 제나라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한민족의 족보를 말살하여 민족과 역사 그리고 강역까지 모두를 제나라로 영구 편입시키려는 술책에서 시작된 범죄행위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들의 광기어린 역사조작 공작은 1929년에 이르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현 서울대학의 전신)에서 시라토리의 ‘단군고(檀君考)’를 공부한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하여 극에 달하게 된다.
이마니시는 한발 더 나아가 단군의 실체를 완전히 부정함은 물론이려니와 아예 단군의 조선민족과 한민족(韓種族)은 아무 연관도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마니시는 자신이 속해있는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사를 편수하는 곳인데 단군은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신화를 조선사에 서술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단군의 기록을 조선사에서 삭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일제의 초대 총독 데라우찌는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전국의 도, 군 경찰서를 총동원하여 전국의 책방, 향교, 서원 그리고 의심나는 개인집들까지 샅샅이 뒤져 수십만부에 달하는 우리의 역사서를 소위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압수하고, 그중 그들의 역사 재창조 목적에 자료적인 이용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조리 일본으로 보내고 나머지 서적들은 모두 불태워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흉내내는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때 그들이 거두어들인 서적들 중에는 ‘규원사화’를 비롯하여 각종 단군관계의 서적들 그리고 심지어는 신채호의 ‘을지문덕’ 같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책들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단군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미국독립사’까지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조선사람은 독립의 꿈도 꿀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이들의 만행이 도를 넘자 드디어 일제의 흉계를 꿰뚫어 본 몇몇 책 주인들이 책을 감추었다. 이 때문에 한국 역사서 수색작업은 처음의 계획을 넘겨 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그 후에는 이 사업을 중추원으로 넘겨 계속하도록 하였다.
1915년, 데라우찌는 총독부 중추원에 편찬과를 설치하고 ‘조선반도사’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이때 매국 역적 이완용과 권중현 등을 고문으로 앉히고 동경대학의 구로사카 가쯔미(黑板勝美), 중추원의 이나바(稻葉岩吉), 교토제국대학의 미우라 슈꼬(三浦周行),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을 지도감독으로 임명하였다.
이들 중 이마니시 류는 특별히 더 교활하여 후일 현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의 국사학과 교수로 활동하면서 악명 높은 식민사관(植民史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원시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또한 그의 정신을 후학들로 하여금 서울대학교의 전통으로 이어가게 하는데 성공한다.
일제의 3대 총독 사이또는 취임초에 일본의 중요정책들을 지시하면서 “조선인이 자신들의 역사와 정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선의 민족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 역사의 위대성을 과장하고 미화하여 일본을 숭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사이또는 1925년에 이르러 일본천황의 칙령을 얻고 ‘조선사편찬위원회’를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로 승격 개편하고 총독부 직속조직으로 만들어 편수회장에 현직 정무총감을 임명한 후 일본측의 고문관 5명에 더하여 조선측에서 이완용, 권중현, 박영효, 이윤용을 선임하였다.
일제의 공작으로 편찬된 ‘조선사’는 1937년에 전 35권으로 완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인 단군의 역사는 흔적도 없이 제거되고, 외세의 내침은 크게 과장하여 기술하는 등 우리 한민족은 처음부터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던 노예 민족임을 극구 강조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의지를 꺾고 영구 점령을 고착화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는 그래도 그자들이 제나라를 위하여 한국병합작전의 공작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抹殺)시키려는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여 일본인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그들의 하수인(下手人) 노릇을 해왔던 대표적인 친일파 이병도(李丙燾)와 신석호(申奭鎬) 등이 일본이 패망하여 쫓겨가고 조국이 광복(光復)을 성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제(日帝)의 식민사관(植民史觀)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그들 일파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정신(民族精神)의 지주(支柱)이신 단군의 역사를 전설적인 신화라고 부정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며 일제의 혼맥을 이어가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민족의 불행은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계승시키려고 ‘한국통사’와 ‘조선고대사고’를 저술하신 백암(白岩) 박은식(朴殷植)선생과 ‘조선상고사’를 쓰신 단재(丹齊) 신채호(申采浩) 선생 등이 해외에서 순사(殉死)하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한민족은 두 분의 큰 선생을 잃었으나 아직도 국내에는 몇몇 분의 명망있는 민족사학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분들은 ‘조선사 연구’의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 선생과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의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 그리고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 남창(南滄) 손진태(孫晋泰) 교수 등인데, 이들 중 정인보, 안재홍, 손진태가 6.25전쟁 중 북측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남아있던 최남선마저도 피난 도중 뇌일혈로 쓰러져 재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제의 수족 노릇을 하던 이병도와 신석호만 국사학계에 남게 되었는데, 이들 중 이병도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신석호는 명문 고려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아무런 견제세력 없이 마음대로 후진들을 양성해 냈고, 그들의 오염된 교육을 받은 후학들은 다시 한국의 교단을 장악하여 일제에 의하여 창조된 식민사관을 한국의 학생들에게 전수시켜 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일반상식으로 통하게 된 식민사관의 보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안호상(安浩相) 박사, 임승국(林承國) 박사, 김득황(金得榥) 박사 등이 중심이 되어 ‘국사찾기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곧 법원에 소송을 벌였으나 이미 골수까지 파고든 식민사관의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을 수 없었고, 이런 움직임에 위기를 느낀 강단사학자들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강력히 단결하며 엄청난 반발을 유발시키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들 식민사관론자들의 발칙한 성공으로 우리민족은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잃게 되었다. 이로서 국민의 대다수는 우리 스스로를 한낱 패배주의에 빠진 열등한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에 와서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포함하여 우리 선조들이 일으켜 놓았던 만주대륙의 영광된 역사를 마구 강탈해 가는데도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 조상들의 강역이었는지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 우리들 속에 숨어있던 식민사관 추종자들의 쾌재가 귀에 울려 그 분함을 참을 수가 없다.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참고로 중국측의 기록인 ‘관자(管子)’에는 기원전 7세기경 벌써 조선(朝鮮)과의 관계를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그 밖에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해경(山海經)’, ‘전국책(戰國策)’, ‘염철론(鹽鐵論)’을 비롯하여 소위 중국의 정사(正史)라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에도 조선의 존재가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한국측의 ‘제왕운기(帝王韻紀)’, ‘세종실록(世宗實錄)’, ‘응제시주(應製詩註)’ 등등 조선의 역사를 유추해 낼 수 있는 기록은 무수히 많다.
특히 제왕운기는 신라(新羅), 고려(高麗), 동쪾북부여(東쪾北夫餘), 남쪾북옥저(南쪾北沃沮), 예맥(濊貊) 등이 모두 단군의 후예라고 썼을 뿐 아니라 신라의 솔거는 단군의 초상화를 1000매나 그렸던 사실과 더불어 고려시기에 삼남지방의 집집마다 단군의 초상을 모시며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식민사관론자들이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는 척하며 결과적으로 노예 민족으로 규정짓는 위만조선론이나 기자조선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 어째서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직도 신화(神話)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 상고사의 제2차의 주인공들은 쥬신족이 동진한 후 공백 지대로 남아있던 바이칼 일대를 장악하고 정착했던 알타이(Altaii-夫餘族)족들이다. 한동안 천해에 머물며 천산-쥬신족들과 거리를 유지했던 알타이-부여족들도 결국 천산-쥬신족의 뒤를 따라 동진 하였고, 선착한 쥬신족들과 충돌하며 자리다툼의 역사를 펼친다.
제3차의 이주민들은 훈족의 신라-황금씨들인데, 이들은 쥬신족[天山族]과 부여족(알타이족) 간에 충돌하는 역사의 틈바구니를 교묘히 파고들어 순식간에 한반도의 남부를 장악하고(신라 제2기) ![]() 민족 구성의 한축으로 참여하니, 이로서 단일 천손족(天孫族)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한민족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민족 구성의 한축으로 참여하니, 이로서 단일 천손족(天孫族)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한민족이 완성되기에 이른다.
결국, 한민족의 주요 구성원은 크게 보아,
① 선사시대부터의 원주 토인족,
② 쥬신족(천산족),
③ 부여족(알타이족),
④ 신라 황금씨(黃金氏族, 훈족)의 4대 족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이다. 물론 이상의 4대 족파들 외에도 남방에서 흘러온 약간의 남방족들과 오랫동안 중국을 식민통치하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화족과의 혼혈족들도 ![]()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녹아들어 있으나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녹아들어 있으나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최근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의 마쓰모도(松本秀雄) 교수는 항체유전자(抗體遺傳子)를 이용하여 연구하던 중 몽골족의 혈청 중에 Gmab3st가 있음을 발견하고 바이칼호수의 북쪽에 있는 브리야트(Buryat)족의 혈청검사를 실시해 본 바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브리야트족 중에서 문제의 Gmab3st를 52%, 한국인들과 일본인들 중에서 무려 41%와 45%를 발견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다 같은 ![]() 민족인 한국과 일본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올 때 뒤에 남겨졌던 또 다른 동족의 무리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민족인 한국과 일본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올 때 뒤에 남겨졌던 또 다른 동족의 무리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브리야트와 몽골족이 우리 민족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던 증거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민족명인 밝달(朴達, 倍達)은 몽골어로 박달-bakdal(baxdal)로 발음되며 그 뜻은 즐거움(樂浪)을 의미한다. 알타이어의 어근(語根)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현재까지 학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B.C 4000년에 이란고원 일대는 벌써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이보다 약간 늦은 B.C 2500년을 전후하여 이집트나 모헨다조(인더스문명), 이리두(二里豆文化쪾B.C 2080~1580), 서만주(西滿洲)의 하가점(夏家店文化)하층 문화가 거의 동시에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만주지방의 청동기 문화는 김산호의 한국통사 회화극본 ‘대![]() 민족통사’ 제1권 ‘치우천황’ 편에서 이미 설명된 바 있는데, 청동기 생산에는 동광과 주석광 등을 분별해 내는 제련기술은 물론, 용도에 맞는 합금비율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하고, 광석의 주조에 이르는 기술공정도 알아야 하며, 광석을 녹이는 시설과 용해된 쇳물을 다루는 거푸집 등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체계적인 기술공들이 있어야만 가능했음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벌써 상당한 수준의 기술체계에 도달하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시를 마치 원시사회처럼 인식해 온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민족통사’ 제1권 ‘치우천황’ 편에서 이미 설명된 바 있는데, 청동기 생산에는 동광과 주석광 등을 분별해 내는 제련기술은 물론, 용도에 맞는 합금비율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하고, 광석의 주조에 이르는 기술공정도 알아야 하며, 광석을 녹이는 시설과 용해된 쇳물을 다루는 거푸집 등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체계적인 기술공들이 있어야만 가능했음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벌써 상당한 수준의 기술체계에 도달하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시를 마치 원시사회처럼 인식해 온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핀란드의 유명한 고고학자 탈그렌(Tallgren)은 청동기 시대는 B.C 1500년경 서부 시베리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동시대 다뉴브 지역의 온예티츠(Aunjetitz) 문명과 연결되었으며, 약 100년 후에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제작된 도끼와 창의 머리부분 형태가 비슷한 것이 중국의 출토물에서 발견됨을 들어 그 기술이 동양에 전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서양의 문명발전이 동양에 비해 선진적이었을 것이라는 잠재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만주의 요령성 건평현 홍산 우하량에서 B.C 3000년경에 제작된 청동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우리 조상들의 청동기가 탈그렌의 주장을 무려 1500년이나 앞지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적 교류가 불과 100년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놀랄만한 가정은 광활한 초원길을 종횡무진으로 이동하는 기마민족의 기동성과 그 활동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넓은 초원을 승마로 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오래전 옛날에도 바로 이런 문화의 교류는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동서양은 서로 격리된 채 제각각의 문명을 따로 발전시켜 왔다는 선입관에 빠진다. 이것은 동양은 즉 중국이고 중국 이외의 문명은 모두 야만인들의 것이라는 서양인들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중국과 서양의 연결고리를 험악한 고산의 계곡이나 살인적인 사막을 통과해야만 하는 뱀처럼 길고긴 비단길을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비단길이 발견되기 전의 동서양 문화는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이들의 연구논문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나태한 학문적인 태도에 있다.
우리는 종종 동서양은 서로 격리된 채 제각각의 문명을 따로 발전시켜 왔다는 선입관에 빠진다. 이것은 동양은 즉 중국이고 중국 이외의 문명은 모두 야만인들의 것이라는 서양인들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중국과 서양의 연결고리를 험악한 고산의 계곡이나 살인적인 사막을 통과해야만 하는 뱀처럼 길고긴 비단길을 유일한 통로로 생각하고, 비단길이 발견되기 전의 동서양 문화는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이들의 연구논문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나태한 학문적인 태도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정치적인 조건들을 극복할 길이 없었다. 그러니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외국의 서적들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여 왔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타성에 젖은 행태를 그 모든 조건들이 환상적으로 변한 오늘날까지도 수정하지 않고, 또한 고통과 위험이 수반하는 모험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그동안 안방학자들이 책상 앞에서 배우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 모든 역사적 실체는 현장검증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에게 권하노니 지금부터라도 제발 안방을 벗어나 현장으로 달려가 제 눈으로 역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확인하면 즉각 용기있게 시정하는 올바른 학문적 태도를 부탁한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동안 중국에 대하여 가졌던 잘못된 시각을 올바르게 교정해 보기로 한다.
지금부터 독자들이 먼저 해야 할일은 지금까지 눈에 익숙한 평면지도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지구의 실제 모양인 둥근 지구본을 머릿속에 입력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줄자를 들어 중국의 넓이를 재어 보라. 그 넓었던 땅이 갑자기 좁아지는 한편, 시베리아의 막막하기만 했던 넓은 대지는 급격히 좁혀져 동서양을 잇는 북쪽 초원의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다시 지구본에서 눈을 떼고 중국의 영토를 마음속에 그려보면 또 다시 옛날부터 익숙해져 있던 평면지도의 왜곡된 중국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중국의 모습은 방금 전의 실험에서 보듯이 실체가 아닌 과장된 왜곡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왜곡되지 않은 중국의 실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중국의 서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개의 엄청난 산맥이 서로 엎치고 덮치듯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헤르시니안(Hercynian) 조산운동기에 거대한 땅덩어리가 융기와 고립을 반복하다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천산산맥(天山山脈)과 알타이산맥(Altaii 산맥)이라고 부른다. 바로 우리 ![]()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주류 민족 중 두 민족 선조들의 시원지(始原地)들인 것이다.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주류 민족 중 두 민족 선조들의 시원지(始原地)들인 것이다.
천산산맥 남쪽의 반대방향으로는 우리의 조상들이 희마리(흰머리)산이라고 부르던 거대한 히말라야산맥이 양팔을 크게 벌리고 중국의 남방진출을 가로 막으며 엄청난 위용을 뽐내고 서 있다. 이곳에는 험악한 산맥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나운 티베트의 산악족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살면서 중국의 숨통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산맥들은 서로 연결되어 살인적인 타림분지를 껴안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새들도 두려워서 피한다는 죽음의 타클라마칸(Taklamakan) 사막이 있다. 사막의 중간에 몇 개의 오아시스가 있으나 그나마 전통적인 기마민족이며 우리 동이(東夷) 9족의 하나인 풍이족1)의 터전이어서 중국의 서방진출을 봉쇄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흉노(匈奴)라고 한다. ‘훈’이나 ‘풍’ 혹은 중국식 발음으로 ‘슝’으로 불렀으면 좋았을 것을 남을 존경할줄 모르고 제 잘난 것만 아는 중국인들은 건방지게도 불필요하게 ‘종 노(奴)’자를 덧붙여 멸칭으로 부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훈족은 오랜 세월동안 중국인의 노예(종)이기는커녕 중국왕실의 공주를 헌납받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중국인의 주인이었다. 참고로 ‘훈’족들은 그들 스스로를 풍(風), 훙 혹은 훈(Hun)이라 불렀음을 밝혀둔다.

이번에는 중국의 북쪽을 보자. 타클라마칸 사막의 접점인 놉노르(Nop Nor)에서 만주의 경계인 싱안링산맥(興安嶺山脈)까지 연결되는 중국의 북변 전체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는 지옥 같은 모래판의 대지 고비사막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죽음의 사막을 무사히 건너 초원에 다다른다 해도 이번에는 공포의 유목민족인 몽골, 선비, 동호라는 소름끼치는 강족들이 번갈아 지키고 있어서 중국의 북방진출 역시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
결국 그들이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남은 것은 동북의 북경지역으로 통하는 좁은 관문뿐인데 이곳으로부터 양자강 이남에 이르는 황해안 연안마저 유사 이래 동이족의 관할지역이어서 그들은 사방의 포위망에 갇혀 고단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신세였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형세로 인하여 중국의 자체문화는 형편없이 뒤떨어졌고, 제 나라의 땅이나 일구고 사는 농민의 생활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노예같은 생활을 바라보는 주위 사방 열강세력들의 입장은 언제라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 무방비 상태의 중국 땅으로 쳐들어가 그들이 일궈놓은 곡식을 원하는 만큼 뺏어올 수 있는 곡창으로 보였다.
이렇게 시작된 주위 열강들의 약탈경쟁은 곧 점령지역에 주저앉아 중국인들을 노예로 활용하는 식민지 개척으로 변해갔고,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종주국과 연결고리를 끊고 자립하는 식민지 자치국가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김산호의 논리가 쉽게 이해되기 힘들겠지만, 17세기부터 불어닥친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확보 경쟁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전쟁무기의 혁명인 막강한 화포의 개량에 성공하였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화약총이 활의 위력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유럽 국가들은 아직 총을 갖지 못했던 국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정복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가까운 아프리카대륙의 거의 전체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 모두를 무차별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상의 그 어떤 곳이 되었든 일단 정복에 성공하면 피점령국의 백성들은 곧 노예로 전락되었으며 그들의 문명은 파괴되고 종교와 문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언어와 문자까지도 점령국의 것을 표준으로 따르도록 강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토산품을 자유롭게 착취하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피점령자가 소유했던 모든 유산은 점령자의 소유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정복자의 법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의 법칙은 그 도덕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관습적인 행위로서, 그 옛날 사방의 열강 속에 포위되어 세상과 고립되었던 중국이라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미 출간된 ‘대![]() 민족통사’ 제1권 ‘치우천황’을 통하여 중국 땅에 세운 배달한국 최초의 식민지국가인 복희나라의 탄생과정을 읽은 바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여명기에 중국으로 침입한 주변 열강의 통치자들 역시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민족통사’ 제1권 ‘치우천황’을 통하여 중국 땅에 세운 배달한국 최초의 식민지국가인 복희나라의 탄생과정을 읽은 바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여명기에 중국으로 침입한 주변 열강의 통치자들 역시 정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정복지를 통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던 문명의 이기들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인 노예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정복자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이기심은 결국 정복자들 간에 전쟁으로 발전되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주위 열강들의 전쟁문화가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을 반복하면서 주위 열강들의 문명과 문화가 식민지(중국) 내에서 서로 뒤엉키며 남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중국에서 발굴되는 거의 모든 상고시대의 문물들은, 당시에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던 화하족들의 토족문화와 유물은 거의 없고, 그들을 한때 정복하여 지배자로 군림하며 살다가 빠져나갔거나 혹은 그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정복자들이 남긴 이민족들의 유물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이처럼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화족) 고유의 문물로 알려진 것의 거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를 했었던 집단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된 선진 문명의 발상지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며 전수 혹은 전달된 문화였다는 것을 문명발생지역의 유물들과 직접 비교하여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적인 문명의 발상지들인 이란의 고원문화, 터키의 흑해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 인더스문화, 안드로노보 문화, 카라노브 초원문화, 알타이 문화 등등이 모두 기마족의 활동지역인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이 제아무리 독자적인 문화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발전의 속도면에 있어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의 정보를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그로부터 더욱 진보된 문화의 재창조를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따를 수는 없다. 특히 예술의 세계에선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 제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무리 천재적인 예술가라 하여도 어느 정도만큼은 타인의 작품을 참고한 후, 그로부터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더욱 개량된 작품이 재창조 되는 것이 일반 상식에 속하는 패턴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민족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천산 쥬신족과 알타이 기마민족들은 그들의 생활 터전인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길을 통하여 일찍부터 수준 높은 문화적 생활환경과 고도의 전쟁무기 제작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세계의 여러 문화권이 새로운 문화를 거듭 발전시키며 전진을 거듭하고 있는 동안 고립무원으로 포위상태에 빠진
중국의 화족들은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 문화적인 답보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열강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독자들은 우리가 무심코 위대한 중국문화의 유산이라고 경탄하던 문물들이 사실은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우겨대는 주위 열강들의 것이거나, 그들이 제각각 중국을 정복하고 식민통치할 때 흘린 것들을 모델로 하여 재생산된 복제품의 수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2)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실체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까이 밀착하고 있어서 중국의 실체를 판단하는데 존재하는 엄청난 왜곡현상을 볼 수 없었던데서 기인한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의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생각되었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속속 발명되고 있는 여러가지 현대적 과학장비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수집된 무한한 정보들을 컴퓨터로 비교 분석하여 역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환상적인 조건에서 역사의 전입 과정과 시간적인 차이를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니 그동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다고 생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적어도 10세기 이전까지는 문화의 강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쪽이란 유럽의 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의 서쪽인 오리엔트와 이들 문화와 접속하고 있던 초원의 중앙아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극동의 시각으로 서쪽이라 칭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중국을 중원으로 호칭하고 현재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전체의 지역을 중국의 역사적인 영토로 보는 인식을 크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위에 본편 단군조선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자.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중국의 상징으로 이야기 되는 만리장성을 잘 알고 있다.
만리장성은 기원전 춘추시대의 제(齊) 나라때 축조가 시작되었다. 성의 축조는 B.C 214년 진(秦)의 시황제(始皇帝) 때부터 본격화 되어 명(明) 때인 16세기까지 약 200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조한 총연장 5000Km 이상의 국경 방어선이다.
진시황 때는 인구중 3명에 한명이 축조에 끌려갔었다고 하고, 노역자로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속설에는 장성의 건설로 100만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며, 명나라 때인 15세기에 증개축하면서도 10만명 이상이 노역으로 죽었다고 전한다.
그야말로 백성의 피로 지어진 셈인데, 중국인들은 무엇이 그리 두려웠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두려움의 크기는 곧 장성의 크기일 것이다. 흉노족을 비롯한 북방세력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흉노는 바로 동이 9족중 풍이족이며 신라와 가야의 세력과 동일인들이다. 또 북방세력이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세력을 말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백만 백성의 피로 얼룩진 압제의 상징이며, 우리에 대한 두려움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관점일 것이다. 또 그들 스스로 만리장성으로 우리 한민족과의 경계를 그었으니 이 또한 생각해 볼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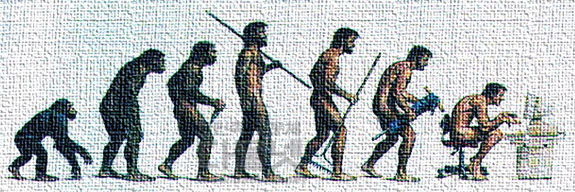
서양의 정신적, 종교적인 세계는 기본적으로 유태교와 기독교인데 그들의 가장 오래된 경전(經典)인 구약성경에 의하면, 여호와(Jehovah)를 창조신으로 하여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것이 불과 6천년 전이어서 인류의 역사 역시 6천년을 상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의 고고학(考古學)은 인류의 출현을 250만년 전이라고 밝혔다.
만약 현대의 고고학의 정의를 믿는다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성서(聖書)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아울러 이단자(異端者)로 몰려 그들 사회에서 온갖 핍박을 각오해야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고고학에서 주장하는 250만년 전의 인류는 인간의 영혼이 없는 유인원(類人猿)으로 원숭이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이브의 탄생으로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고, 인류의 옛 조상들은 유인원의 진화론으로 교묘하게 정리하는 속임수를 학계의 정론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서양문화 신봉자들은 그들의 선입견을 수정할 생각은 접어두고 우리의 고서들이 밝히고 있는 우리민족의 9000년 역사를 조소(嘲笑)로 일관하고, 신시배달한국(神市倍達桓國)의 5900년의 역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단군조선(檀君朝鮮)의 역사마저도 모조리 신화(神話)로 돌려 버리는 경솔한 결론을 단정적으로 내리고 있다.
참고로, 한반도의 구석기(舊石器) 유적(遺蹟)들만 살펴보아도 그 역사가 40만년에서 80만년 그리고 심지어는 100만년 전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정착했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만주지방은 이것보다도 아득하게 더 오래되었음이 최근까지의 과학적인 발굴활동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의 역사를 불과 2300년으로 한정해 보려는 식민사관론자(植民史觀論者)들의 학자답지 못한 행위는, 우리의 진정한 고대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자들은 다음에 열거된 몇몇의 예를 통하여 한반도의 인류 문명사가 얼마나 소급해 올라갈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인류사회의 진화과정을 정치적 진화과정을 흔히 군사회단계(群社會段階, band-society)⇒부족단계(部族段階, tribe)⇒수장국단계(首長國段階, chiefdom)⇒국가단계(國家段階)로 발전해 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서 역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국가가 이루어진 단계인 한웅의 신시 배달한국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배달한국의 주역인 천산족이 동방으로 침략해 오기 이전부터 이미 선주하고 있던 제1기 정착민들에 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감히 그들의 역사를 펼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뒤늦게 몇몇 지각 있는 분들이 나서서 세계거석문화협회(World Megalithic Association, 유인학 총재)를 창설하고 2000년 11월에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世界遺産)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아일랜드의 ‘보인계곡유적’이나 영국의 ‘스톤헨지’의 거석문화에 감동하고 있던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엄청난 고인돌 문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다만 전 세계인들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경탄함에도 그런 문화를 소유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에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고인돌문화를 단순한 농경문화의 흔적쯤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군조선시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본서는 고인돌의 비밀 중 몇 가지의 중대한 사실만이라도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인돌의 조성시기에 대하여서는 각계의 다채로운 의견들이 있어왔다. 혹자는 종교의식의 산물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단순한 부족장들의 무덤정도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크기와 무게가 무려 100톤에 달하는 엄청난 건축물을 수백개씩이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집단들의 문화적인 역량에 대한 것이다.



◀ 한국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인돌은 ‘dolmen’을 말한다. dolmen은 켈트어로 탁자(dol)와 돌을 뜻하는 men의 합성인 dol-men(돌로 된 탁자)의 모양이라는 뜻이다. 돌멘은 돌기둥 위에 큰돌(뚜껑돌, 蓋石)을 얹은 분묘의 한 형태로서 일명 지석묘(支石墓)라고도 한다.

지금까지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의 주인들은 중앙아시아로부터 동진을 거듭하여 천해를 거치고 북만주로 진입한 다음 만주대륙을 타고 좀더 따뜻한 남쪽으로 남진하여 한반도에 이르고 있었다. 물론 그중에는 아예 물을 건너 왜열도까지 진출한 후 큰 물에 가로막혀 종착지에 이르게 된 무리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기고 온 문화의 흔적도 이를 역추적(逆追跡)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물론 개중에는 남방으로부터 흘러온 약간의 이민족들도 우리들 한민족 속에 녹아들고 있지만 이들은 거대한 대양을 넘어와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더러 단 한번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일이 없었으므로 한민족의 소수민족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고인돌은 그 무게와 크기가 서로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지만 대체로 40톤에서 큰 것은 100톤을 넘고 있다. 고인돌의 축조는 작업공정상 채석, 운반, 가공 및 조립이라는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기술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곧 당시의 사회발전 수준과 사회의 구성, 조직적인 계급관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가령 당시 사람들의 몸무게를 평균 60kg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견인력인 600N이므로 100톤의 중량을 움직이는데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노동에 투입된 100명의 건장한 장정들 외에도 또 다른 100여명의 보조 인원들과 기술자들, 노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을 추정해 보아 그 부족은 최소한 1000여명 이상의 대부족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들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힘을 모아서 돌을 움직여야 하므로 100톤의 무게를 지탱할만한 끌 판을 제조해야 하고 이를 잡아 끌 든든한 밧줄이 적어도 20가닥 이상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한 개의 견인력 총량이 3000N이 되므로 새끼줄이나 칡넝쿨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다면 이를 견뎌낼 만한 밧줄을 만들 생산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간단하게만 보이던 고인돌의 존재는 각 분야의 기술들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사회가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고 사회적인 조직과 규율이 엄격히 존재했던 문명적인 대부족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고인돌은 또한 당시 사람들의 제천의식과 천상경배 사상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고인돌의 뚜껑 표면에 새겨진 별자리의 표식으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천문 관측기술은 북두칠성의 정확한 위치와 남두6성, 그리고 심지어는 달의 동적 궤도를 그린 것까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들의 천문지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당시의 문화수준을 원시 농경사회의 수준으로 폄하하는 선입감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선사시대 역사는 2만∼3만년인 것으로 추정될 뿐 그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물증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주먹도끼 발견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선사역사 기록을 바꾼 쾌거였다. 당시 전곡리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슐리안형 구석기 유물로 확인됐고 전곡리 일대는 사적 268호로 지정돼 있다.

우리는 아직도 당시의 청동기 제품에 대하여 조잡한 원시적 산물로 보는 선입견이 있다. 마침 북한의 ‘조선전사’ 제 2권에 정가와자 6512호 무덤에서 발굴된 비파형 단검과 청동 화살촉들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해 놓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비파형 단검(琵琶形短劍)의 경우 합금비율이 동-72.43%, 아연-6.84%, 주석-13.52%였고 화살촉은 각기 동-66.39%, 아연-11.62%, 주석-9.93%였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경도와 탄성을 다같이 중시하는 단검의 경우 주석의 비율을 높게 하고, 대량 소모품인 화살촉은 주석의 비율을 낮게 하여 구하기 힘든 주석을 아껴 썼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벌써 각 제품의 용도에 알맞게 합금을 하는 수준의 금속제련 기술이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는 중동 지방의 유물중 B.C 31세기의 이란제 동제품은 동과 비소의 합금이며 주석청동 기술은 B.C 24세기에 비로서 개발되었고, 시리아의 동제품도 동, 비소,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아연-청동 문화는 알타이어계의 문화권과 관계되며 천산에서 천해,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 일치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3원소 합금계를 능숙하게 다루었던 우리 선조들의 청동야금술은 당시의 다른 문명권에 비하여 월등히 선진적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지적해 보면 이런 사람들 중 누구하나 인간을 흙으로 빚어 탄생시키고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 성경은 거짓이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소위 실증사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오랜 역사를 없애버리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인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던 것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인들의 악의적인 음모를 모르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넋 빠진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인 것이다.
1947년에 발표된 ‘단군신화의 연구(김재원)’에서는 중국 산동성 가상현(嘉祥縣) 자운산(紫雲山) 아래에서 발견된 무씨사당(武氏祠堂) 석실(石室)의 돌벽에 새겨진 그림글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림의 내용이 단군의 설화임이 분명하다고 증언하면서, 13세기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강단사학자들의 악의적인 주장을 한동안 잠재웠다.

위 그림의 원본은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영광전(靈光殿)에 있던 것을 옮겨놓은 것으로 표현 형식은 음각에 의한 선묘(線描)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부조적(浮彫的)인 것도 있고 채색(彩色)을 입힌 것도 있다.
조각 그림은 석조의 분묘(墳墓)나 사당(祠堂)의 내벽(內壁), 석관(石棺), 석주(石柱) 등의 표면과 전(塼), 축묘(築墓)의 석문(石門) 등에 새겨진 장식화상(裝飾畵像)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의 그림은 후석실의 제 3석에 4층으로 그려진 것들로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단군의 신화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온 것들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의 그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아래에 보이는 석실그림-1을 살펴보면, 지상의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으며 하늘로부터 천마를 타고 하강하는 한웅과 사람들이 천부인(天符印) 3개를 들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아래에 있는 그림-2에는 나팔을 불고 있는 바람신 풍백(風伯)과 북을 치고 있는 구름신 운사(雲師) 그리고 물통을 쥐고 있는 우사(雨師)가 보이고 오른편에는 문제의 곰과 호랑이도 있다고 했다.

← 석실그림-1

대![]() 민족통사를 그리는 본 필자에게 있어서 단군의 개국신화야 말로 한민족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 석실의 그림내용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귀중한 물증(物證)이었다. 따라서 이 그림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김재원씨가 보았다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민족통사를 그리는 본 필자에게 있어서 단군의 개국신화야 말로 한민족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 석실의 그림내용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귀중한 물증(物證)이었다. 따라서 이 그림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김재원씨가 보았다는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물론 학자들마다 그림을 해석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단군의 역사를 그리기 위하여 작은 역사의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는 필자의 끈질긴 노력에 비하여, 단군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묘사를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림-1과 그림-2는 독자들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이미지를 좀더 선명하게 수정한 것이다.
필자는 먼저 이 중요한 무씨사당 석실그림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림들을 따로 구별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그림 하나하나의 복장과 역할 등을 전체적인 환경에 대입시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이 문제의 그림이 아쉽게도 단군신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림의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분석하게 되었다.
다음은 석실그림에 대한 결론이다.
그림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해모수(解慕漱) 신화이다. 독자께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사료의 내용과 연결지어 그림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기 바란다.
휴애거사(休崖居士) 범장(范樟)의 북부여기-상(北夫餘紀-上)편을 보면 : “단군쥬신[檀君朝鮮] 47세 고열가단군 57년, 임술년 4월 8일에 23세의 천왕랑(天王郞) 해모수(解慕漱)가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까마귀 깃털로 만든 모자)을 쓰고, 허리엔 용광검(龍光劍)을 차고, 오룡거(五龍車-다섯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500명의 신하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와 정무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제 다시 그림의 내용을 들여다 보자. 우선 둥글게 말려 엉켜있는 기하학적인 구름의 형태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구름위로는 지금까지 천마(天馬)라고 해석된 용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할 점은 용들의 모습이 구렁이 몸통에 짧은 다리를 가진 동양의 전통적인 용이 아니고, 말처럼 긴 다리에 날개를 달고 있는 중앙아시아식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의 용은 훗날 훈족이나 스키타이족의 정복활동 중 서방세계로 전파되어 전해오는 서양식(西洋式) 용(龍, Dragon)의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바로 ‘기마민족의 관점에서 묘사되는 용’인 것이다.
오룡거 위의 주인공은 천왕랑 해모수의 모습인데 머리에 까마귀 깃털로 된 오우관(그림-2에 더 똑똑히 보임)을 쓰고 어깨에는 망토를 걸치고 있다.
주위에는 해모수를 호위하는 종자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원통형의 고깔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형태의 모자 역시 주로 중앙아시아의 기마민족의 풍습이다. 행렬의 앞에는 면류관을 쓴 임금과 그의 신하들이 엎드려 천왕랑의 일행을 맞고 있다.
그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중앙아시아를 출발한 알타이 부여족 해모수 군단의 동양 정복활동을 그린 것인데, 그것은 용을 타고 진출해 오는 알타이 부여복식의 대군단 앞에 중국복식의 귀족들이 엎드려 항복을 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그림-2의 내용은 그림-1의 이야기에 이어 지상(인간세계)에 내려온 해모수의 수레를 사람들이 끌고 정복된 성(궁궐-아치형의 구렁이 모양 용)안으로 진입하는 장면과 이로 인해 일어난 궁궐내의 혼란상을 묘사하고 있다.
석실그림-2

그림-3은 선진적인 무기로 무장한 알타이 부여족들의 침입에 맞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정복 집단(산동지역의 중국인들? 혹은 선주 천산 쥬신족?)의 전투장면들이다.
석실그림-3

그림-4의 상단 그림은 정복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천상의 모습이고, 하단은 천왕랑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의 모습이다.
석실그림-4

그림-5역시 그림-4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는 신 정복자의 엄청난 세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알타이 부여족들은 이미 정복활동을 끝내고 새로 정복한 땅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곳에 새나라를 입국하는 과정에 들어간 듯 보인다.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아, 새로운 위계질서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장관들이 새로운 임지로 이취임하는 등의 활기차고 희망찬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 석실그림-5

무씨사당 석실의 그림들은 이외에도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하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시장(市場)의 분위기나 제염장(製鹽場) 등의 풍경은 흥미 있는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청국(淸國) 건륭황제(乾隆皇帝)시에 발굴한 무량석실(武梁石室) 화상석(畵像石)의 제3석에 나타난 삼황오제(三皇五帝)와 진국(秦國)의 형가(荊軻)와 자객(刺客) 등의 묘사들은 모두 당시의 역사적인 실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양의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중국을 움직일 수 없는 천하의 중심으로 놓고 동양에서 출토된 고대문물들을 모두 자생한 것으로만 보았고, 또 동양에서 발생된 모든 고대사 역시 중국과 연결지어서만 해석하려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주에서 촬영된 지구의 사진을 통하여 중국이 위치한 지형이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산맥, 서쪽으로는 쿤룬 산맥과 천산산맥, 서북방면은 알타이산맥, 북쪽은 고비사막 등으로 삼면이 완전히 막혀있고, 황해로 통하는 동쪽방면마저 동이족의 활동영역이어서, 지금까지 한족문화로 분류했던 중원문화가 사실은 그들을 식민 통치했던 주변 열강세력인 소위 사이(四夷)들의 문화였거나 혹은 그들에 의하여 전달된 외부 세상의 문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중국 중심의 천하관에서 벗어나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대사의 진실에 접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보고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안방에 앉아 풍부한 중국 고서들의 기록만 믿고 이를 통하여 역사를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음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 세상에 깔린 엄청난 정보를 컴퓨터 하나로 펼쳐볼 수 있고 원한다면 달나라 여행도 꿈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자세도 문헌 중심의 연구나, 남의 연구를 다시 정리해오던 구태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실재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사건들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증해 봐야함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발굴되는 새로운 물증들을 과감하게 옛 기록에 대입시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 분석한 후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역사서의 오류들을 바로잡아 다시 정리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만주(滿洲)의 요령성(遼寧省)은 유사(有史) 이래로 우리 ![]() 민족의 심장부로서 그곳에서 발생된 모든 문화의 유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민족의 심장부로서 그곳에서 발생된 모든 문화의 유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 민족의 역사적 유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역사의 진리를 머릿속에 넣고 다음의 설명에 집중하여 주기 바란다.
민족의 역사적 유물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역사의 진리를 머릿속에 넣고 다음의 설명에 집중하여 주기 바란다.
근세에 들어 신석기 문화인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중심부인 현 요령성 건평현(建平縣) 우하량(牛河梁)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인 신시 배달한국 제10세 갈고(葛古-독로한) 한웅천황이나 제11세 커야밝[居耶發] 한웅천황의 치세에 해당되는 B.C 30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우리조상들의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사학계를 크게 흥분 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5지점 2호총에서 발굴된 나녀상인데, 이 여인이 신고 있는 가죽 장화와 오랜 기마생활로 인하여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 이 집단이 기마족의 생활습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적봉시(赤峰市) 송산구(松山區)에서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같은 집단의 출토 유물인 무녀상(巫女像)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무녀상은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런 타입의 고깔모자는 전통적으로 알타이 부여족의 습속이어서 이들 집단이 신시 배달한국 시대에 벌써 이곳까지 진출해 왔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알타이(Altaii) 부여족(夫餘族)의 역사적 시원에 관해서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김산호 회화역사 시리즈 대![]() 민족통사 제3편 대제독 이순신(大提督 李舜臣), 제4편 백제와 왜(百濟와 倭)에 이어 나올 제5편 ‘부여사’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본 ‘단군조선’편에서도 단군의 천하통일 정복전쟁에 커다란 장애세력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알타이 부여족(훅泰쪾夫餘族)의 실체를 무시하고는 단군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여족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단군의 역사에 대한 실체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민족통사 제3편 대제독 이순신(大提督 李舜臣), 제4편 백제와 왜(百濟와 倭)에 이어 나올 제5편 ‘부여사’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본 ‘단군조선’편에서도 단군의 천하통일 정복전쟁에 커다란 장애세력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알타이 부여족(훅泰쪾夫餘族)의 실체를 무시하고는 단군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여족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단군의 역사에 대한 실체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우선 본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알타이(Altaii) 부여족(夫餘族)’과 ‘천산(天山) 쥬신족[朝鮮族]’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우선해야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형성을 간단히 나누어 보면, 우선 제1기 정착 집단(定着 集團)으로 수만년 전부터 이 땅에 선주하고 살아오던 고인돌 문화의 주인공 원토족(元土族)들을 말할 수 있다. 다음 제2기의 이민 집단(移民集團)은 천산지역을 출발하여 천해(바이칼) 지역에 머물러 한님시대[桓仁時代]를 거치고 다시 동진하여 만주대륙에 우리민족 최초의 나라인 신시 배달한국과 단군조선을 세우니 이들을 구별하여 ‘천산 쥬신족’으로 부르고자 한다.
우리 민족의 형성을 간단히 나누어 보면, 우선 제1기 정착 집단(定着 集團)으로 수만년 전부터 이 땅에 선주하고 살아오던 고인돌 문화의 주인공 원토족(元土族)들을 말할 수 있다. 다음 제2기의 이민 집단(移民集團)은 천산지역을 출발하여 천해(바이칼) 지역에 머물러 한님시대[桓仁時代]를 거치고 다시 동진하여 만주대륙에 우리민족 최초의 나라인 신시 배달한국과 단군조선을 세우니 이들을 구별하여 ‘천산 쥬신족’으로 부르고자 한다.
제3기 이민 집단에 해당하는 부여족들은 천산에 이웃한 알타이산맥 너머에 자리잡고 중앙아시아의 대초원을 누비던 유목민족이었다. 부여족과 쥬신족은 처음에는 서로 멀리 있어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부여족이 쥬신족의 뒤를 따라와 천해일대를 장악하더니 또다시 동진을 계속하여 흥안령(興安嶺)을 넘으면서 선주한 쥬신족과 충돌하게 되었다.(본편 042~043쪽의 지도를 참고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초기에 쥬신족의 강력한 힘에 가로막혀 흥안령을 넘지 못하던 부여족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넓게 퍼져있던 그들의 부족들이 계속적으로 합류하여 오면서 강력한 집단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의 등장과 활동상황을 전하는 사서들이 너무나도 여러가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를 전공한 학자들조차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종종 착각을 일으키곤 한다. 본편은 거의 동시대에 우리 역사 속에 함께 등장하는 이들 집단을 천산 쥬신족과 구별하여 ‘알타이 부여족’이라 불러 혼란을 막고자 하였다.

다음의 예들은 각종 고사서에 등장하는 알타이 부여족의 이름들이다. 본서가 왜 알타이 부여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이해 할수 있을 것이다.
① 부여(夫餘), ② 불에[不興], ③ 부유(鳧臾), ④ 포예(逋濊), ⑤ 밝쥬신[發朝鮮], ⑥ 부리(夫里), ⑦ 예(穢), ⑧ 예맥(濊貊), ⑨ 개마(蓋馬) 등...
이 외에도 알타이 부여족은 벌(伐), 불(弗), 불쥬신(卞쪾弁朝鮮), 영치[令支], 리치[離支], 산융(山戎), 가우리[藁離國], 맥(貊), 호족(虎族, 貊族), 변(弁)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름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민족 집단이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이유는 유목민족의 특성으로 알타이 부여족 안에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었음에서 찾을 수 있고, 이들의 동진(東進)이 천산 쥬신족의 경우처럼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의 부족 단위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동쪽으로 이동해 온 사정에서 기인한다
.
‘밝[?]’의 발음이 ‘밝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단군쥬신을 맥족(貊族)2) 혹은 맥국(貊國)으로 불렀고, 쥬신의 유명한 활은 맥궁(貊弓)이라 하였다.
쥬신을 ‘貊’으로 호칭하기 이전에는 ‘박’이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 발음 밝(불, 부루, 발)을 표기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표기들은 모두 밝은 임금인 단군(檀君)을 뜻하는 ‘檀(박달나무 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밝음(光明)’의 뜻인 것이다.
결국 ‘단군(檀君)’은 ‘밝은족(광명족)’의 ‘밝’과 땅이나 지역(영토적인 의미)을 뜻하는 우리의 옛말 ‘달’이 합쳐져 ‘밝달(檀)’이 되고, 임금님이라는 뜻의 ‘군(君)’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우리말의 한자 표기인 것이다.
옛날에는 ‘부루다라’나 ‘바라다라’라 하던 것을 받침을 쓰거나 겹모음을 쓰던 시기에 와서는 ‘박달(밝달)’이나 ‘배달’로 변음 되었을 것이다.
단군의 명칭이 이처럼 족명(族名)과 밀착하게 된 것은 단군족이 그들 스스로를 하늘민족 즉 천손족(天孫族)으로 자부하여 밝은족(광명족)을 뜻하는 밝달(박달, 배달)족으로 족명을 호칭함에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배달한국에 뒤이은 단군조선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특히 알타이 부여족들이 바로 배달한국에 이은 단군쥬신[檀君朝鮮]의 건설과정에 호족(虎族쪾범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최대의 도전세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기에 단군조선의 역사를 다루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고대사는 이렇게 그 시작부터 서로 얽히고 꼬이면서 파란만장한 역사의 막을 열었던 것이다.
이로서 단군조선의 건국에 즈음한 당시에 실재했던 각 민족들 간의 국제적 역학관계 그리고 이에 따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보는 작업을 끝내고 본제목이 예시한 단군조선의 이야기를 펼치기로 한다.
본편의 타이틀인 ‘단군조선(檀君朝鮮)’은 신시 배달한국의 전통과 맥을 이은 나라이다. 따라서 배달한국의 역사를 미리 짚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시조 커밝한 한웅의 개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제2세 커부리[居佛理]한웅, 제3세 우야고(右耶古)한웅, 제4세 모사라(慕士羅)한웅, 제5세 태우의(太虞義)한웅, 제6세 다의발(多儀發)한웅, 제7세 커련[居連]한웅, 제8세 안부련(安夫連)한웅, 제9세 양운(養雲)한웅, 제10세 갈고(葛古-瀆虜韓)한웅, 제11세 커야밝[居耶發]한웅, 제12세 주무진(州武愼)한웅, 제13세 사와라(斯瓦羅)한웅 그리고 제14세 자오지(慈烏支-蚩尤天皇) 치우천황까지의 역
치우천황이 스스로 배달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출전하여 화하족과 한민족간의 운명을 걸고 싸운 탁록전쟁을 대승으로 끝내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화하족들을 추격하여 반란군을 철저히 진압하고 수괴 헌원을 잡았으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복종을 맹세하므로 천황은 오히려 그에게 황제의 벼슬을 하사하고 화하족을 통치하도록 한 사실은 이미 전편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치우천황
천황의 강력한 응징에 놀라 한동안 복지부동하던 화하족(華夏族)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다시 배달![]() 국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려는 모반을 꾸미는 징후가 있음을 감지한 천황은 그들의 숨통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청구를 독립시켜 천황가의 영지로 삼고, 스스로 배달
국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려는 모반을 꾸미는 징후가 있음을 감지한 천황은 그들의 숨통을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먼저 청구를 독립시켜 천황가의 영지로 삼고, 스스로 배달![]() 국의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며 청구의 시조로 남는다.
국의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며 청구의 시조로 남는다.
이러한 청구의 전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청구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동안 화하족들의 반란은 없었다.
청구(靑丘)가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동안, 배달한국의 제15세 치액특(蚩額特)한웅과 제16세 축다리(祝多利)한웅의 치세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개천(開天) 1445년(戊辰) B.C 2453, 혁다세(赫多世)한웅이 배달
개천(開天) 1445년(戊辰) B.C 2453, 혁다세(赫多世)한웅이 배달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배달![]() 국의 번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소위 천손사상(天孫思想)을 믿어 단일민족의 혈연의식(血緣意識)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종교적인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점은 세계의 타종교들이 모두 전도와 설득 혹은 정복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여 전파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오랜 세월동안
국의 번영을 몇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소위 천손사상(天孫思想)을 믿어 단일민족의 혈연의식(血緣意識)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종교적인 역사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점은 세계의 타종교들이 모두 전도와 설득 혹은 정복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여 전파시켜 왔던 것과는 달리, 오랜 세월동안 ![]() 국[桓國] 시대를 지내오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의 조화로 보는 천(天), 지(地), 인(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믿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승화하면서 수두[蘇塗-소도] 중심의 천제(天祭)와 교육 등으로 단합하는 분위기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桓國] 시대를 지내오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의 조화로 보는 천(天), 지(地), 인(人)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믿음이 종교적인 사상으로 승화하면서 수두[蘇塗-소도] 중심의 천제(天祭)와 교육 등으로 단합하는 분위기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천(開天) 1518년 B.C 2380, 커붉단(또는 커불단) 태자는 배달한국의 제18세 한웅으로 제위(帝位)에 올랐다.
그동안 신시 배달한국[倍達桓國-밝달한국]은 천해(天海-바이칼호)로부터 동쪽으로 옮겨와 흥안령을 경계로 영고탑(寧古塔-黑龍江省)까지의 넓은 만주대륙을 정복하며 정착에 성공했고, 또 중국 산동성 일대에 자리잡은 치우천황의 청구국이 천황의 유지를 받들어 중화족들이 경거망동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있어서 만년제국의 기틀이 자리를 잡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일단 제국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커불단 한웅은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정책을 바꾸어, 아직까지 자치 독립권을 인정해 주고 있던 만주대륙의 동남방면(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남만주와 함경도 일대) 일대를 욕심내기 시작한 듯 보인다.1)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만주 일대에는 기마민족인 천산 쥬신족이 서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오기 훨씬 전부터 정착하여 살고 있던 농경토족(農耕土族)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살아왔던 이 땅의 원토족들로서, 신비에 쌓인 고인돌 문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한데, 우리의 고기(古記)들은 이들을 가리켜 웅족(熊族)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고기들은 웅족을 기록하면서 왜 곰 웅(熊)자를 선택하였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옛말이 지신(地神-땅을 지배하는 신)을 ‘![]() ’님 이라고 발음한데서 찾을 수 있다.
’님 이라고 발음한데서 찾을 수 있다.
옛날에는 하늘의 신 ‘하느님’을 줄여 ‘![]() 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땅의 신을 ‘
님’으로 불렀던 것처럼 땅의 신을 ‘![]() 님’으로 호칭 했었으므로 웅족(熊族)의 ‘웅’자가 ‘
님’으로 호칭 했었으므로 웅족(熊族)의 ‘웅’자가 ‘![]() ’의 발음을 취하기 위하여 씌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웅족은 ‘곰족’이 아니라 ‘
’의 발음을 취하기 위하여 씌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웅족은 ‘곰족’이 아니라 ‘![]() 족(감족)’으로 읽어야 한다.
족(감족)’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발전하여 현대적 개념의 고대국가 탄생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존에 협력적인 관계이던 감족을 통합하여 보다 강력한 세력으로의 성장을 꾀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족(감족)은 이미 10만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동안 바이칼에서 몽골, 만주대륙 그리고 한반도에 걸쳐 넓게 자리잡고 이 땅을 일구고 다듬으며 지배해 온 진정한 대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원토족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의 신(神)을 의미하는 감(地神-지신)족이라는 명칭은 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족(감족)은 이미 10만년이 넘는 유구한 세월동안 바이칼에서 몽골, 만주대륙 그리고 한반도에 걸쳐 넓게 자리잡고 이 땅을 일구고 다듬으며 지배해 온 진정한 대지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한민족의 원토족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의 신(神)을 의미하는 감(地神-지신)족이라는 명칭은 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들이 일으킨 찬란한 문화를 선사시대 혹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정도로 가볍게 정리해 버리지만 이들 선조들이 꽃피웠던 빗살무늬토기 문화나 고인돌 문화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8000년 전에서 1만년 전의 것들로서 가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기록될만한 것들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우리의 고대사를 논하면서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고인돌 문화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들을 다함께 묶어서 고조선 문화인 것처럼 애매하게 처리해 버리는 버릇이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사람들도 그저 그럴 것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술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는 고인돌 문화의 주인공들에 이은 빗살무늬토기의 주인공들 그리고 비파형 청동검 문화의 주인공들이 각각 다른 민족 집단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구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아울러 단일민족으로 표현되는 우리 민족 형성의 진실도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제부터라도 먼 옛날 이 땅으로 들어와 우리 한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한 조상들의 뿌리와 맥을 찾는 작업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일이 힘들고 지루하며 노력에 비하여 세인들의 관심밖에 있는 사학적(死學的)인 학문이 될지라도 제 민족, 제 조상들의 올바른 족보를 찾는다는 사명감으로 매달려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먼저 그들이 소속된 집단(민족적)을 찾아 구별해 내고, 그들의 출발지와 경유지, 이민당시 보유했던 문화적인 유물, 그리고 시기(時期) 등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찾아내어 복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한민족 상고사의 수수께끼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본서가 한민족 역사의 복원작업에 이와 같은 원칙을 세우고 진행시키고 있음도 차제(此際)에 밝혀둔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다시 본론으로 돌려 신시 배달한국의 마지막 천황 커불단 한웅의 치세를 들여다 보자

아래 : 서울 암사동 유족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높이가 40.5cm, 구경이 35.1cm의 대형 토기(경희대학교박물관 소장품)
오랜 세월동안 신시(神市) 배달한국[倍達桓國]의 충실한 제후국(諸侯國)으로 백두산 일대에 넓게 자리잡은 감족[熊族]들의 나라가 근래에 들어 갑자기 나타난 서쪽 범족(虎族)들의 도전을 맞아 수년 동안 전쟁을 하며 국력이 많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의 만주대륙은 신시 배달한국이라는 절대적인 종주세력 밑에 지방 영주들이 자치통치하는 제후국들이 난립하고 있었다. 이때의 국가 형태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의 강력한 종주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배달 연방제국’ 체제인데, 이러한 정치 형태는 고대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이런 정치제도권 안에서 지방 제후국들 간의 충돌은 늘상 있어왔던 일이었고 그때마다 중앙정부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당한 쪽의 반감을 불러와서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제후국의 어느 한쪽이 다른 제후국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는 승전국의 세력이 그만큼 확장되어 종주권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종주세력의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이때 감족[熊族]의 영역을 침입하고 있는 범족(虎族)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옛 기록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족의 이웃에 또 하나의 종족이 보이는데 고기(古記)는 이들을 범(虎)족이라고 쓰고 있다. 호(虎)는 호랑이를 뜻하므로 감족을 곰(웅쪾熊)족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과 분쟁상태에 있는 그들을 호(虎)족으로 호칭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지(三國志)’의 ‘위지(魏志)’에 “예(濊)족들은 범을 산신(山神)으로 모셔 제사 지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신화상에서 호족(虎族)으로 나타나는 집단이, 역사의 기록상으로는 ‘예족(濊族)’이라는 종족명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예족’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밝히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예족’은 바로 알타이 부여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만주대륙에 나타나 감족[熊族]의 영역을 침략하는 부여족(夫餘族)도 사실은 고향땅의 환란을 피하여 새롭게 정착할 피난처를 찾는 유랑민족이었다. 원래 이들 부여족의 고향땅은 알타이산맥을 등지고 서쪽으로 펼쳐진 대초원으로서 넓은 초원을 무대로 평화롭게 목축으로 살아가던 정통 기마민족이었다.
그런데 돌연 우랄산맥의 남부와 북부 이란고원의 선진적인 전투기술을 습득한 이민족들의 파상적인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민족적인 파멸이라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게 되었다.
이처럼 불길한 기운이 엄습한 가운데 부여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족장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회의의 결과,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하는 야만적인 서부 유목민족들의 엄청난 공격에 맞서 부족의 안전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결론에는 모든 족장들이 동감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부여족 전체가 함께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각 부족별로 따로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당시의 부여족들에게는 전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강력한 대칸(Great Kahn)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대족장회의가 하나로 합의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하자 참을성이 없는 부족장들은 대족장회의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개별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에 불안을 느낀 또 다른 부족들도 그들의 부족들을 이끌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고향땅을 떠나갔다. 이렇게 하여 한때 중앙아시아를 누볐던 부여족들은 천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물론 일부 감상적인 부족장들은 오랜 생활의 근거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거부하며 그들의 부족과 함께 남아 끝까지 고향땅을 지키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좀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일부 부족장들은 그들의 부족들을 이끌고 태양이 솟는 동쪽의 만주대륙을 신천지로 바라보고 움직여 갔던 것이다.
이때 동쪽으로 향했던 부족들이 꿈의 동방대륙에 당도하고 보니 그곳엔 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동해 온 천산 쥬신족들이 벌써 현지의 원토인족들을 정복하고 배달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세워 통치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한 기질의 부여인들은 타 부족민을 우선 경계하는 본능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런 습성은 오랜 세월동안 유목민족으로서 무법이 난무하는 초원에서 살아남은 생존의 법칙이 그러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단 한번도 문명국의 제도권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부여인들로서는 우선 천황의 법에 복종을 맹세한 후, 천황의 자비에 의존하여 한정된 영지를 할양받고 정착을 허용받는 문명제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리하여, 소위 난폭한 범족(虎族)으로 기록된 부여의 선발대는 배달한국의 제후국들 중 가장 허약하면서 순박한 기질을 가진 감족[熊族]의 영토에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단 한번도 문명국의 제도권 안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부여인들로서는 우선 천황의 법에 복종을 맹세한 후, 천황의 자비에 의존하여 한정된 영지를 할양받고 정착을 허용받는 문명제국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리하여, 소위 난폭한 범족(虎族)으로 기록된 부여의 선발대는 배달한국의 제후국들 중 가장 허약하면서 순박한 기질을 가진 감족[熊族]의 영토에 욕심을 내고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신시 아사달에서 지방 제후국들 간의 자리다툼을 조용히 주시만 하고 있던 커불단 한웅은 원토족 국가인 감족의 나라가 신생 범족들의 사나운 공격을 막지 못하고 토멸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싸움의 당사자들을 모두 성도(聖都)로 불러 올렸다.
 전쟁의 양측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잠시 휴전을 전제로 적당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 한웅천황의 의도였다.
전쟁의 양측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잠시 휴전을 전제로 적당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하여 평화적인 공존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 한웅천황의 의도였다.
그러나 천황의 뜻을 왜곡하여 생각한 양측은 이번의 어전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서로 상대측의 부도덕한 행위를 질타하였다. 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해도 양측의 주장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해 보였고 급기야는 인신공격까지 더해지며 협상의 분위기는 더욱 더 나빠지기만 했다. 생각해보면 이번의 휴전협상은 그 시작부터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미 수천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아오는 감족(토족-농경족)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무례하게 창칼로 위협하며 빼앗으려는 범족(부여족-기마족)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것이고, 혹시 천황의 중재 노력에 화답하는 의미로 일부 영지의 할애에 동의하여 준다하여도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범족은 넓은 땅을 필요로 하여 양측의 요구를 서로 만족시키기는 처음부터 힘든 일이었던 것이다.
이로서 어렵게 마련한 천황의 중재는 보람도 없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제 남은 길은 힘의 논리대로 해결되도록 묵인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지켜오던 배달한국의 불문율(不文律)인 제후국들 간의 다툼에 불개입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천황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길 뿐이었다.
아사달의 평화협상이 결렬되자 범족들은 더욱더 격렬하게 감족들을 공격해 들어갔고,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감족들의 필사적인 방어는 그 맥을 다하며 풍전등화 같은 멸족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천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천의 강력한 기마군단(騎馬軍團)을 파견하여 이미 감족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범족군의 후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천황군의 출현에 범족 군단의 장군들은 크게 당황하며 그동안 감족의 왕성을 철통같이 포위했던 주력군을 되돌려 천황군을 맞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감족군은 천황군이 감족을 구하기 위하여 범족군의 배후에 나타났음을 알고 사기가 충천하여 모두 성밖으로 나와 범족군을 앞뒤로 공격하니 범족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두 국경 밖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럼 커붉단 한웅천황이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제후들의 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의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은 범족이라는 위협적인 이름(별칭)으로 우리 역사에 등장한 부여족들의 강력한 전투능력을 보고 이들을 언젠가는 배달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을 가능성이다. 이것은 나라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정관으로서 당연히 판단 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의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출정 이유가 보인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감족의 왕이 은밀히 펼친 현대적 개념의 로비(Lobby) 활동에 있다.
 감족왕[熊國王]은 감국의 지신(地神) 지위에 있던 외동딸
감족왕[熊國王]은 감국의 지신(地神) 지위에 있던 외동딸 ![]() 녀(무녀,巫女, 熊女) 공주를 아사달 천황성으로 보내 커붉단 한웅과 정략적(政略的)인 국혼(國婚)을 성사시키고 한웅(桓雄)의 부인 웅녀(雄女) 황후(皇后)의 영향으로 천병(天兵)을 출병시켜 범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녀(무녀,巫女, 熊女) 공주를 아사달 천황성으로 보내 커붉단 한웅과 정략적(政略的)인 국혼(國婚)을 성사시키고 한웅(桓雄)의 부인 웅녀(雄女) 황후(皇后)의 영향으로 천병(天兵)을 출병시켜 범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이쯤에서 본론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단군신화라고 알려져 있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의 기이(紀異) 제2편 고조선(古朝鮮)편에 기술되어있는 단군의 탄생 비화를 원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위서(魏書)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어서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는데, 요(堯)나라와 같은 때였다.1)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 환웅(桓雄)께서 천하를 헤아리려는 뜻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했다. 아들의 뜻을 아신 아버지는 삼위태백(三危太白)을 내려 살펴보고 한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보내어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다스리도록 했다.
환웅은 3천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의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렸다. 이곳을 신시(神市)라 이르며, 그를 환웅천황(桓雄天皇)이라고 부른다. 천황은 풍백(風伯)쪾우사(雨師)쪾운사(雲師)와, 곡식(穀食)쪾수명(壽命)쪾생명(生命)쪾형사(刑事)쪾선(善)쪾악(惡) 등을 각기 주관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무릇 3백 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 시켰다.
이 무렵, 곰(熊) 한 마리와 범(虎)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환웅은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되 햇빛을 1백일 동안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족히 얻으리라.” 곰과 범은 이를 얻어서 먹었다.
곰은 그것을 지킨 지 삼칠일(21일)만에 여자의 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범은 능히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는 고로, 매양 신단수 밑에서 잉태하기를 바라며 축원했다.
이에 환웅은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이름 했다. 이때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지 50년째 되는 해로 경인년(庚寅年) 이다.”
이 이야기는 민가에 전해오는 전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당시에 실제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유추해 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민족 고대사의 비밀을 풀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의 원토족과 제2기의 이민집단인 천산 쥬신족, 그리고 아직은 진출 초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기 이민집단인 알타이 부여족이라는 3개의 민족집단이 초기 한민족 구성의 3대 핵심 민족집단임을 알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무대는 아직 상고사의 여명기에 해당하여, 선주세력인 감족과 새로 진출해온 천산 쥬신족들간의 결합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 단군신화의 비밀을 풀어 보기로 하자.
우선 단군신화는 이 땅의 가장 오래된 주인으로 선주 농경토족인 감족[熊族]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신족(地神族)의 의미로 이들을 ![]() 녀[雄女]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이 땅으로 새로 진출해 온 천산 쥬신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으로 부르고 있다.
녀[雄女]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이 땅으로 새로 진출해 온 천산 쥬신족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족으로 부르고 있다.
그 동안 쥬신 천손족 18대 한웅들의 통치에 눌려 살며 반목을 거듭하던 원토족인 감족들은 배달한국 말기인 커붉단 한웅 치세에 이르러 새로운 침략세력인 알타이 부여족을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기로 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는 땅을 지배하는 감족을 웅녀로 표현했고, 천산 쥬신족을 천손족(天孫族)으로 하여 하늘과 땅을 결혼시킴으로써 두 종족의 역사적인 결합 장면을 드라마틱 하게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 민족의 시조(始祖) 단군(檀君) 이전의 역사를 모두 신대(神代)의 역사로 취급하고 인간 단군을 하늘과 땅의 자손인 신성(神聖)한 절대권자(絶對權者)로 취급하려는 의도에서 꾸며진 것이다.
민족의 시조(始祖) 단군(檀君) 이전의 역사를 모두 신대(神代)의 역사로 취급하고 인간 단군을 하늘과 땅의 자손인 신성(神聖)한 절대권자(絶對權者)로 취급하려는 의도에서 꾸며진 것이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서양의 유일신만 믿도록 세뇌교육을 받은 철없는 일부 종교인들이 역사와 신화를 구별조차 못한 채 단군에 얽힌 신화를 종교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한국의 정통역사로 해석하며 단군의 실체를 부정하는데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소위 위대한 한민족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론통일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외래(外來) 종교 신봉자들이 무법으로 날뛰며 안하무인격으로 우리의 역사를 폄하함은 물론이고 토속종교와 전통문화들을 짓밟고 마구 훼손하는데도 이들의 횡포가 무서워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한심한 나라로 변해버렸다.
그런데, 한국에 세워진 단군의 동상들이 몇몇 외래종교 신봉자들의 광란으로 그 목이 잘리고 참혹하게 끌어 내려지는 엽기적인 행태가 마치 홍위병의 난동을 구경 하듯이 별 국민적인 저항 없이 자행되는 꼴을 그저 의아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중국은, 시조 단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의미를 깨닫고 재빨리 한국에서 추방당한 단군의 신화를 과감하게 포용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때마침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 공작과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중국은 먼저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으며 단군과의 인연을 강조하기 위한 조형물을 만들어 신화를 포함한 단군의 모든 것이 자국의 역사임을 기정사실화 시키려 하고 있고, 그 첫 번째의 작업의 어느새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큰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단군을 모셔가는데 국력을 기울이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조 단군의 의미가 고구려의 그것보다 100배나 큰 것을 알고나 있는가? 만약 이대로 단군을 빼앗긴다면 한민족은 그 뿌리를 잃게 되고 만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조상을 박대한 나머지 이웃동네 사람이 내 조상의 족보를 파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족보도 없고 그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집단으로 변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조상을 박대한 나머지 이웃동네 사람이 내 조상의 족보를 파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족보도 없고 그 근본도 모르는 떠돌이 집단으로 변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필자가 너무 과장되게 사태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독자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왼쪽의 사진 ①은 중국의 국가 예산으로 세워진 만주 만티엔싱(滿天星)의 웅녀황비(雄女皇妃) 조각 석상(石像)이다. 이 웅녀황비상은 산의 정상에 세워져 멀리 산 아래에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돋보이게 모셨는데, 오른손에는 단군신화의 내용 그대로 마늘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쑥을 들고 서있다.
사진 ②는 산정의 웅녀황비 석상으로 오르는 길의 중간에 세워진 것인데 이 역시 단군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웅녀황비가 인간이 되어 시조단군 을 생산하기 전 모습인 곰(熊)을 조각한 것이다. 앞에 놓인 것은 먹다 남은 마늘이고 발아래 바위 위에 놓인 것은 쑥이다.
을 생산하기 전 모습인 곰(熊)을 조각한 것이다. 앞에 놓인 것은 먹다 남은 마늘이고 발아래 바위 위에 놓인 것은 쑥이다.
사진 ③은 웅녀황비 석상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본 필자의 모습(키-170cm)을 담아 촬영한 것이다.
그림 ④는 북한정부가 평양시 강동구 강동읍 문흥리 대박산(大朴山) 기슭에 세운 단군릉(檀君陵)의 웅장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진 ⑤는 한국이 자랑하는 강화군(江華郡) 화도면(華道面) 마리산(摩利山)의 참성단(塹城壇) 전경이다.
이들을 비교해 보고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필자는 참으로 갑갑한 마음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배달한국의 제18대 한웅천황의 황후가 된 감족[熊族]의 공주를 본서는 웅녀황비(雄女皇妃)라 이름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서들은 모두 감족을 곰(熊)족으로 표현하고 웅녀황비를 곰녀(熊女)로 표기해 왔다. 그러나 본서는 한웅[桓雄]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웅녀(雄女)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웅녀가 그녀의 이름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는 여인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인들이 자신만의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상고사(上古史)에 나타난 여인들은 모두 고유한 이름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표기할 때 항상 누구의 딸이라거나 누구의 부인 혹은 그 여인들의 출신지역이나 직업 등을 이용한 대명사를 사용한다.


← 단군성모 웅녀황비 존영
웅녀황비(雄女皇妃)는 우리 한민족의 시조로 추앙받는 단군성조(檀君聖祖)의 어머님이시다. 이러한 민족의 성모(聖母)를 한낱 전설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인간화 한 곰의 모습으로 부각시켜 철없는 아이들로부터 우리민족은 모두 곰새끼들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웅녀황비가 친정인 감족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혼으로 커붉단 한웅의 황비가 된 것은 이미 밝힌바 있다. 성모 웅녀황비가 아직 감족의 왕녀로 있을 당시 그녀는 나라의 안녕을 위한 천제(天祭)를 주관하는 제관(祭官)으로 천녀(天女)의 위치에 있었다. 천녀란 여자단군(女子檀君)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고령에 도달한 부왕(父王)을 도와 나라를 이끌었었던 것이다.
이런 경력을 가진 그녀는 이후 배달제국의 황후로서의 역할도 눈부시게 해내는데 그녀의 업적을 보면, 우선 최고의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유약한 성품의 천황을 도와 제국을 강건하게 만들어 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인 감족의 나라를 범족(虎族-夫餘族)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내었다. 또한 단군을 생산하고 민족의 성조(聖祖)로 길러낸 현명한 성모였다.

한동안 제국의 변경을 넘나들며 소란을 떨던 범족(부여족)들이 아직까지는 역부족임을 통감하고 흥안령의 서쪽에 머물며 자리를 잡자 오래간만에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이때 웅녀황비는 커붉단 한웅의 황손을 잉태하는 경사를 맞아 제국의 안팎이 즐거움으로 충만하였다.
산월(産月)이 다가오자 웅녀황비는 차가운 날씨의 신시 아사달을 떠나 친정어머니가 계신 백두산 아래 감족의 땅으로 돌아갔다.
백두산(白頭山)은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정기(精氣)가 서린 민족의 성산(聖山)이다. 산의 정상 양달에는 하늘 못인 천지(天池)가 있고 산중 깊숙이 응달에는 천지(하늘 못)와 감지(지상 못)의 걸침 역할을 하는 작은 하늘못(小天池)이 있다.
성산(聖山-白頭山)의 아랫녘 친정에 자리 잡은 황비는 매일같이 소천지에 들어 깨끗하게 목욕(沐浴)을 하고 다시 하늘못에 올라 뱃속의 황손이 한민족을 이끌어줄 성인의 덕목(德目-忠,孝,仁,義)과 이를 이행(履行)할 수 있는 자질(資質)을 갖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축원(祝願)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드디어 산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신시 아사달의 커붉단 한웅은 잠시 정무를 접어두고 황비의 측근(側近)에 행궁(行宮)을 마련한 후 황비의 축원행사에 동참한다.
이때 한웅은 황비의 축원과는 달리 자신이 이룩하지 못했던 ![]() 민족 천하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황자의 탄생을 빌었다.
민족 천하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황자의 탄생을 빌었다.
때는 개천(開天) 1528년 신묘년(辛卯年-B.C 2370年) 5월 2일 인시(寅時-오전 3~5시), 웅녀황비는 백두산의 소천지옆 신단수(神檀樹)1) 아래에서 한민족의 시조로 추앙받게 되는 단군성조(檀君聖祖)2)를 생산하는 기쁨을 맞는다. 단군은 커붉단한웅의 셋째 아들이고 웅녀황비의 첫 아들이다.
2) 신화에 등장하는 곰, 감은 지모신(地母神)을 뜻하고 한웅천황은 하늘의 천손(天孫)이다. 이는 곧 웅녀 지모신과 천손의 결합으로 한민족의 시조이신 천손 단군(天子, 至高神)이 탄생되셨다는 뜻이다.
옛사람들이 단군의 아버지인 한웅의 나라를 몰랐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배달민족(倍達民族)이라고 부르면서 배달![]() 국[倍達桓國]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 보아도 단군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한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인색했을까? 그 이유는 천해로부터 이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의 주인인
국[倍達桓國]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 보아도 단군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한웅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인색했을까? 그 이유는 천해로부터 이 땅으로 들어와 이 땅의 주인인 ![]() 족(원토족)을 정복하고 지배해 온 커밝한 한웅의 천산 쥬신족을 이민족으로 보고 있었던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족(원토족)을 정복하고 지배해 온 커밝한 한웅의 천산 쥬신족을 이민족으로 보고 있었던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커붉단 한웅 치세에 이르러 알타이 부여족의 강력한 침략을 맞게 되자 쥬신족과 감족들로 하여금 민족공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게 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서로가 연합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감족의 왕녀와 쥬신족의 한웅이 결합했고 그 결과 감족과 쥬신족 모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군이라는 새 인물이 탄생된 것이다. 이로부터 쥬신족은 정복지배자라는 우월한 신분적 차별을 버리고 감족들과 한민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로 볼 때 진정한 한민족의 탄생 분기점인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단군(檀君)이 ‘밝은 땅의 임금’의 뜻 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 그가 단군의 지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용했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천지사방을 다 뒤져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단군의 본명을 찾는데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다만 추측컨대 옛 사람들이 단군 같은 위대한 성인의 함자를 무엄하게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단군이라는 왕호를 본명처럼 사용했지 않았을까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본서도 단군의 유년시절 이름을 감히 고유명사 단군으로 쓰기로 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바랄뿐이다.
단군이 커붉단 한웅의 제3황자임은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러나 감족과 쥬신족 화합의 화신인 단군은 탄생과 더불어 태자의 지위를 얻는다.

아기 단군이 무사히 첫돌을 맞았을 때 아버지인 한웅천황과 어머니 웅녀황비는 아기단군을 데리고 백두성산의 하늘못(天池)에 올라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하늘의 백성인 하늘민족(![]() 민족-天孫族)을 이끌어줄 단군을 내려주심에 감사함을 고(告)하였다.
민족-天孫族)을 이끌어줄 단군을 내려주심에 감사함을 고(告)하였다.
이때 하늘은 쌍무지개를 하늘못에 곱게 띄워 단군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현명하고 정숙한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성품의 웅녀황비의 행동을 보며 전통적인 한민족 어머니상의 한 표상(表象)을 보는 듯하다.
우선, 그녀가 친정인 감국[熊國]에 있었을 때 그녀는 감족의 민족적인 단결과 평안을 위하여 여성단군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충실히 해냄으로써 한국여성의 강인한 책임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감족이 이민족인 알타이 부여족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하자 과감하게 천산 쥬신족과 정략적인 국혼(國婚)을 성사시킨 후 천황군을 끌어들여 부여족 최초의 침략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함으로써 조국이 국난에 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웅녀황비는 단군을 잉태하고 산월이 가까워지자 친정으로 돌아와 단군를 출산하는데 이는 감족과 쥬신족의 결속된 연결고리를 만방에 과시하는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쥬신족 황자(皇子)의 고향땅이 감족의 터전인 백두산하(山河)가 되게 함으로서 감족의 무궁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는 영특함을 보이기도 한다.
웅녀황비의 뛰어난 지혜는 단군의 어머니로서도 빛나게 되는데 쥬신족 혈통을 이어받은 적통의 제1황자와 제2황자에 이어 제후국 출신의 웅녀황비 소생인 제3황자 단군으로 하여금 황태자의 자리를 이어받도록 하는 위업을 달성시킨 것이다.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신시 배달한국의 한웅 정부내에 이미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중신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적통 제1, 제2황자들의 위협에 맞서 제3황자인 단군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웅녀황비는 단군을 친정에서 출생시켰고, 이 과정에서 단군에게 민족생존의 희망을 걸고 있는 감족들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국의 서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부여족들의 강력한 기마군단과 예사롭지 않은 전투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커붉단 한웅은 황태자 지명문제보다 감족과 쥬신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시켜 제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격변하는 정세는 웅녀황비로 하여금 계속되는 황실내부 후계자 싸움의 초점에서 벗어나 어린 단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제 황비의 다음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닥쳐올 운명적인 황태자 선발전을 위하여 어린 단군을 황태자의 학식과 자질을 갖춘 인물로 키우기 위한 교육에 온갖 정성을 다 하는 일이었다. 바로 이점도 자식들의 성공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한국 어머니들의 전통과 다르지 않다.
소년 단군은 과연 어떤 문자를 통하여 학문수업을 하였을까? 당시는 아직 한글이나 한문자가 정착되지 않은 문자발달의 여명기로서 서로 불완전한 글자들이 무수히 난립하고 있던 시대로 보인다.

우선 우리의 옛 사서에 보이는 기록 중 문자에 관한 최초의 것은 녹도문(鹿圖文)이다. 한웅천황 치세 중 최대의 업적중의 하나로 단연 녹도문 창조를 들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문자로 기록된다.
녹도문의 창조는 ![]() 국시대로부터 전해오는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三一神誥) 등을 천문(天文)이 아닌 인간들의 문자로 기록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천황의 특명을 받은 신지혁덕(神誌赫德)1)은 모래밭 위에 난잡하게 찍혀있는 사슴들의 발자국을 본떠서 소위 사슴그림글자인 녹도문(鹿圖文)을 완성하였다.
국시대로부터 전해오는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三一神誥) 등을 천문(天文)이 아닌 인간들의 문자로 기록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천황의 특명을 받은 신지혁덕(神誌赫德)1)은 모래밭 위에 난잡하게 찍혀있는 사슴들의 발자국을 본떠서 소위 사슴그림글자인 녹도문(鹿圖文)을 완성하였다.
또한 ‘규원사화(揆園史話)’를 보면 고조선 시절에는 신치의 사슴글자, 결승(結繩-노끈매듭), 산목(算木-셈막대기) 등의 시조 문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송(宋)나라 때의 ‘속박물지-이석’은 진국(辰國), 부여(夫餘)에서는 한문식의 내려쓰기와는 다르게 옆으로 가로쓰기 하는 글이 있었고 또 ‘결승(結繩)’과 ‘계목(쫶木-목판에 글 새김)’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태백일사(太白逸史)’에서는 고구려 영양왕(쳉陽武元好太烈帝) 11년(A.D 600)에 태학박사 이문진(李文眞)이 유기(留記)를 요약하여 신집(新集-5券)을 지었다고 기록하면서 태백산의 푸른 벽에 독특한 귀신글자가 새겨있고 고조선에는 산목(算木)이 그리고 부여에는 전목(佃木)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고운선생사적(孤雲先生事蹟-최국술, 1925)’에서는 태백산에 단군전으로 쓰는 비석이 있는데 해석하기가 힘든 것을 최치원이 번역하였다고 하여 아직 세상에 소개되지 않은 또 다른 글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대쥬신제국 제3세단군 가륵(大朝鮮帝國 第3世 嘉勒壬儉)의 치세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가륵 2년 경자년(B.C 2181, 임검이 수두[蘇塗]를 많이 세워 삼륜구서(三倫九誓)2)를 가르쳤다. 이해 봄, 을보륵 박사가 임검의 특명으로 신치(神誌)의 글3)을 좀더 개량시킨 국문정음(國文正音) 38자를 만들어 바쳤는데 이를 가림토라고 한다.”
1) 신지(神誌) : 신지는 고대 문자를 주관하던 기관(벼슬)의 이름이고 혁덕(赫德)은 신지의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다. 신지의 ‘지’는 우리말의 ‘치’로 왕이나 한집단의 통치자, 큰 귀족 혹은 대인을 이르는 말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은 기록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권1에는 신시(神市)로 썼고 같은 책의 권3에서는 신지(神誌)로 다른 글자를 선택하여 썼으며,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은 신지(臣智), 진서(晋書)의 동이전은 신지(臣芝), 그리고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東夷傳)에는 대자(大者-馬韓各有長帥大者 自爲臣智)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다.
결국 우리말 ‘신치’를 소리말이 아닌 중국식 한자로 표기함에 있어서 神市, 神誌, 臣智, 臣芝에 이어 종국에는 신치의 뜻을 풀어 大者라는 글자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상의 예만 눈여겨보아도 한자로 기록된 우리의 역사서를 읽을 때 한자(漢字)의 뜻풀이는 무모하며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적는 방법으로 관리들의 글이라는 소위 이두(吏讀)식의 발음을 버리고 반드시 우리의 옛 발음을 되찾아 읽을 때만 정확한 본뜻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삼륜구서 : 삼륜(三倫)은 애(愛), 예(禮), 도(道)를 말하고 구서(九誓)는 효(孝), 우(友), 신(信), 충(忠), 손(遜), 렴(廉), 의(義), 지(知), 용(勇)이다.
3) 신치의 글 : 한웅천황때 신치[神誌] 혁덕(赫德)이 만든 녹도문(鹿圖文)을 쥬신제국때 이 벼슬을 존속시켜 글을 일차 개량시켰으나 아직도 글이 불완전하여 나라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시켰다.

'문화&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수일의 실크로드 재발견_01 (0) | 2009.12.03 |
|---|---|
| 허민_동양수학은 없었나 (0) | 2009.12.02 |
| 이맥[李陌]의 太白逸史 (0) | 2009.12.01 |
| 배달의 꽃 무궁화 (0) | 2009.11.30 |
| 박석무의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_03 (0) | 2009.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