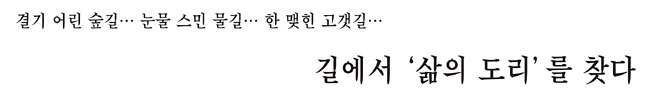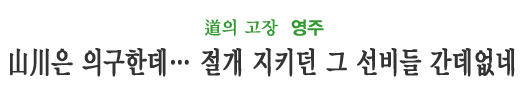 |
무릇 유교문화에서 ‘선비’라 함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대쪽처럼 곧은 이들’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교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인(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조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바로 이런 ‘선비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의 자취가 오롯이 살아 있는 곳이 바로 경북 영주 땅입니다. 그곳에는 제 한 몸 편코자 염치를 버리지 않고, 안빈낙도와 청렴을 몸소 실천했던 비장하고 고결한 선비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자 죽음을 각오하고 비장하게 맞섰던 선비들의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道)가 아니라면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였던 서릿발 같은 정신을 가진 선비들의 땅 영주. 거기에 우리 땅 최초의 서원이 있고, 퇴계가 드나들었으며 훗날 선비촌이 들어서게 된 것도 다 우연은 아니지 싶습니다. 여름의 끝에 영주로 향합니다. 선비들이 흘린 피가 강물이 돼 삼십 리를 흘렀다는 순흥의 고을을 거쳐 유배된 조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 형 세조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섰던 금성대군의 죽음의 자리에도 들르고, 단종을 태백산의 산신으로, 금성대군을 소백산의 산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깊은 산중의 서낭당에도 들렀습니다. 숨가쁜 역사의 순간에 밀서를 들고 소백산을 넘나들었을 선비들의 비밀스러운 자취를 쫓아 고치령과 마구령을 타고 넘으며, 정감록의 십승지지로 꼽히는 금계와 의풍마을까지 둘러봤습니다. 전날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퇴계의 소백산 유람길을 쫓아 ‘죽계구곡’의 촉촉한 숲길을 딛기도 했습니다. 소백산을 끼고 있는 영주 땅에는 지금은 흐려졌지만 도합 여섯 곳의 ‘구곡(九曲)’이 있었답니다. 아시다시피 ‘구곡’이란 중국 남송의 성리학자 주희가 무이산 계곡의 아홉 굽이 경치를 읊은 ‘무이구곡가’를 본떠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른여섯 봉우리와 아흔아홉의 동굴이 있다는 무이산은 절경이었겠지만, 무이구곡가는 그저 풍경의 아름다움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통해 성리학을 공부하는 단계적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의와 염치를 아는 ‘선비’가 되는 과정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요. 아마도 눈이 흐려서 그랬겠지요. 촉촉하게 비로 젖은 죽계구곡에서, 운무가 넘실거리던 고치령과 마구령의 숲길에서는 그저 감탄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서릿발 같은 정신으로 그 길을 디뎠을 옛 선비들의 발자취 정도만 어림잡아 짐작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는 내내 따라오던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이재(理財)에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 같은 선비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 대쪽 같은 선비의 결기와 정신이 깃든 땅 거기에 금성대군의 피 묻은 돌이 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혹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금성대군의 선혈은 500여 년이 지나서도 붉은 기운이 선명하다고 했다. 경북 영주군 단산면 단곡2리의 두레골. 물길 옆 어둑한 숲 속의 서낭당 앞에서 시간의 태엽을 감는다. 때는 1457년 정축년. 삼촌인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로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던 그해. 단종의 또 다른 삼촌인 금성대군이 영주의 순흥 땅으로 유배된다. 거기서 금성대군은 비밀리에 단종을 왕위로 복귀시키려는 거사를 계획한다.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왕의 자리에 오른 세조는 더 이상 형이 아니었다. 순흥 땅을 다스리던 부사 이보흠을 비롯해 수많은 영남의 선비들이 가세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고 있었지만, 온몸으로 그 바퀴를 세우려 했다. 사욕은 없었다. 오로지 선비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서슬 퍼런 결기,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을 뿐이었다. 결과는 참혹한 비극이었다. 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비의 밀고로 발각이 됐고 그 뒤는 짐작하다시피 피바다였다. 금성대군은 죽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선비들도 참수를 면치 못했다. 보복이 가혹하기도 했겠지만, 왕위 찬탈을 거부하는 대쪽 같은 선비들을 죽음 말고는 다스릴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선비들의 피는 죽계천을 적시고 20리 떨어진 동촌마을까지 붉은 핏물이 이어졌다. 그래서 동촌은 지금까지도 ‘피끝’으로 불린다. 그때의 핏자국을 따라나선 길이었다. 순흥에서 부석 쪽으로 향하다 만나는 자그마한 다리 단곡교를 건너기 직전에 좌회전해 단곡2리 마을표지판을 따라 가면 두레골이 있고 거기 어둑한 숲 안에 서낭당이 있다. 서낭당은 한가운데 금성대군 신당이, 그리고 그 곁에 자그마한 산신각이 있다. 금성대군 신당 안에는 금성대군의 피가 묻은 돌이 있다는데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리를 따르다 죽음을 당했던 금성대군은 소백산의 산신으로, 청령포로 유배돼 사약을 받은 단종은 태백산의 산신이 됐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순흥 사람들은 여기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제를 지낸다. 엄동설한. 죽계의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한 제관이 황소를 잡아 제물을 만들고 소지를 태워 하늘로 날린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의 끝. 서낭당 앞에는 사람 대여섯이 모여 굿을 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살아생전의 기개와 결기 때문일까. 이곳 서낭당의 금성대군 신당은 영험하기 이를 데 없는 기도의 명소로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굿을 주재하던 무당이 천을 잡아 찢자 그 앞에서 손을 비비는 이들은 무엇이 그리도 간절한지 어깨까지 들썩거리며 흐느꼈다.
정축년 선비들이 흘린 피가 흘러내렸다던 죽계천. 그 계곡을 따라 ‘죽계구곡(竹溪九曲)’이 있다.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따라 빼어난 경관 아홉 곳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인 명소다. 훗날 영조 때 순흥부사였던 신필하가 구곡을 정했고, 그 뒤에 퇴계도 소백산을 오르면서 따로 구곡의 이름을 지어붙였다고 했다. 빼어난 자리마다 바위에 ‘제O곡’이란 글귀가 뚜렷하지만, 애써 아홉 개의 구곡을 다 찾을 필요는 없다. 신필하는 소백산으로 오르는 중턱의 절집 초암사에서 소수서원 쪽으로 내려서면서 차례로 구곡을 정했고, 퇴계는 거꾸로 소수서원에서 오르면서 구곡을 정한 데다, 둘이 정한 구곡이 겹치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곳도 있으며, 더러는 자취가 묘연한 곳도 있으니 그렇다. 죽계구곡은 근래 들어 초암사를 중건하면서 시멘트 도로를 깔아놓아 풍광이 흐트러졌다. 배점마을에서 만난 한 촌로는 두 사람이 걷기도 어려웠던 조붓한 흙길이었을 때의 정취에 대면 지금의 풍광은 어림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구곡이 주희의 ‘무이구곡가’에서 온 것이고, 무이구곡이 빼어난 경관을 빌려 선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배워가는 과정을 담은 것이라고 보면, 구태여 거기서 풍경에만 욕심을 낼 일도 아니지 싶다. 게다가 초암사로 가는 길은 온통 사과밭이다. 벌써부터 발갛게 사과가 익어가며 달큰한 향을 뿜어내고 있다. 물소리를 찾아 기웃거리다보니 마침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이 초록의 숲 그늘 아래서 제법 멋진 그림을 만들어낸다. 숲길과 계곡의 경관을 즐기겠다면 죽계구곡보다는 구곡이 끝나거나 시작하는 초암사 위쪽의 달밭골 가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더 낫겠다. 초암사에서 달밭골로 이르는 구간은 소백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해온 엄한 출입금지 구역이었는데, 영주시가 소백산 자락길 1코스를 내면서 비로소 문을 열었다. 소백산 자락길 1코스는 소수서원에서부터 죽계구곡을 지나 초암사와 달밭골을 거쳐 비로사까지 이르는 12.6㎞의 길이다. 4시간30분짜리 코스인 자락길 1코스를 다 걷는 게 정석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없거나 걷기에 자신이 없다면 핵심만 골라 뽑아보는 방법도 있다. 길이 좁긴 하지만 초암사까지는 차로 가고 거기서부터 심산유곡의 마을 달밭골까지만 걸어서 왕복한다면 나무랄 데 없는 여정이 된다. 달은 산(山)의 옛말. 산중에 다닥다닥 밭이 있었다고 해서 달밭골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초암사에서 달밭골까지의 숲길은 계곡의 물길에 바짝 붙어서 간다. 하늘을 어둑하게 가리는 숲도 좋고, 폭신하게 밟히는 흙길의 탄력도 더할 나위 없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계곡 물길이 그려내는 아름다움이다. 마침 늦여름의 잦은 비로 계곡은 맑은 옥수로 넘쳐나고 있다. 숲의 초록은 촉촉한 습기로 더욱 짙어지고, 무시로 밀려드는 운무가 숲을 가렸다가 지웠다를 반복하는데 바위에 부딪힌 계곡물이 부챗살처럼, 치마처럼 퍼지는 계곡을 따라 걷는 길. 소백산 자락이 숨겨둔 아름다움을 보겠다면, 더도 덜도 말고 딱 지금이다. # 소백산 고갯길을 차를 타고 넘는 맛 소백산 자락에서 다른 길을 짚자면 고치령과 마구령을 꼽을 수 있겠다. 이 두 고갯길은 소백의 동쪽 자락을 영주에서 단양으로, 말하자면 경북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산길이다. 걷는 길이 대세지만, 도로포장이 된 이 길은 지루하게 걸어 넘기보다는 차로 넘어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