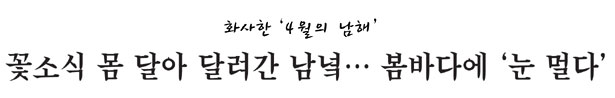 |
올해 봄꽃 개화는 두서가 없기도 하거니와 꽃소식의 북상 속도도 따라잡기 숨찰 정도로 빠릅니다. 매화, 산수유에 이은 벚꽃의 물결이 지금 남녘을 해일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매화는 이미 분분히 꽃잎을 날리고 있고, 벚꽃도 이제 거의 절정입니다. 올해는 봄꽃 마중의 시기를 겨누기가 쉽잖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숨차게 꽃소식을 따라가기보다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 한껏 무르익은 봄을 만나 보면 어떨까요. 이번주 LIFE & STYLE은 북상하는 봄을 길목에서 기다리는 대신, 눈 돌리는 곳마다 ‘봄 아닌 것’이 없는 풍경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제안합니다. 해마다 봄이 축포처럼 터지는 봄의 전망대인 섬진강을 지나서 당도할 곳은 남해입니다. 한반도의 아랫도리는 어디건 지금 봄의 기운에 흥건히 적셔 있지만, 그중에서 구태여 남해를 꼭 집어 말하는 건 거기가 해마다 봄이 폭죽처럼 터지는 섬진강을 지나 당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 쌍계사의 벚꽃이 지난 주말 절정에서 딱 한 치쯤 모자랐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벚나무마다 연분홍 꽃잎이 함박눈처럼 쏟아져 내리겠지요. 그렇다고 구태여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촉촉한 봄비로 벚꽃잎이 다 떨어졌다 해도 아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남해에서는 지고 만 벚꽃보다 더 화사한 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동에서 남해대교를 건너 당도하는 남해에서 이즈음 만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길섶의 초록 능선에서 꽃대를 올린 야생화, 해협의 죽방렴에서 잔물고기를 거두는 어부, 바다 쪽으로 주르륵 흘러 내려간 다랑논, 유채꽃 만발한 해안을 끼고 있는 나른한 봄바다…. 남해는 지금 선혈 같은 동백꽃들로 낭자하고, 현호색이며 산자고, 양지꽃, 제비꽃들이 아예 꽃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남해에는 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바다와 어우러지는 만개한 벚꽃 남해의 벚꽃은 지금 절정을 막 넘어서고 있다. 남해의 벚꽃 핀 풍경은 다른 곳과 다르다. 꽃이야 뭐 다를 게 있을까만, 남해의 벚꽃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바다다. 잘 알려지지 않았으되 남해에서 최고의 벚꽃은 남해대교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노량마을에서 왕지등대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바다를 끼고 피어난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데, 벚나무가 양쪽에 도열해 있는 길 끝에 순백의 등대가 서 있는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벚꽃은 왕지등대를 지나 해안가 언덕의 진목마을에 이르기까지 4㎞ 남짓이나 이어진다. 그 길에서는 내내 벚꽃 너머로 쪽빛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남해대교 왼편의 노량∼차면 간 도로 역시 바다를 끼고 가는 벚꽃터널이다. 이맘때 북새통을 이루는 쌍계사의 벚꽃터널이 부럽지 않다. 여기뿐만 아니다. 남해의 내륙이나 해안 곳곳에 벚꽃은 흔전만전이다. 특히 남해읍 인근의 자그마한 저수지인 다초지의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없다. 저수지 둑에는 노란 개나리가 만발해 있고, 한쪽에 벚나무 군락이 흰 구름처럼 꽃을 피워 낸다. 저수지 주변에는 붉은 튤립까지 심어져 있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벚꽃 외에 남해에서 만나는 대표적인 봄꽃이 바로 유채다. 밝은 노란빛의 유채꽃들은 다랑논의 빈 밭에서, 해안가 마을의 자그마한 마당에서 화사하게 꽃을 틔웠다. 유채로 이름나기는 두모마을만 한 곳이 없다. 올해는 군데군데 붉은 흙더미가 드러나 관리가 좀 부실한 듯하지만, 그래도 한창 꽃대를 올리고 있는 유채꽃이 활짝 피어나면 이만 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서고 흔하지 않다. 남해까지 내려간 참에 해수욕장 고운 모래톱에 발자국을 찍고 와야겠다면 MT 온 대학생들이 북적거리는 상주해수욕장보다는 거기서 멀지 않은 송정 솔바람해변을 추천한다. 솔바람해변에는 백사장을 끼고 심어진 해송 군락이 멋스러운 데다 백사장 끝 노송 숲 가운데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곳곳에 마련돼 있다. 보온병에 커피믹스 하나만 챙겨 간다면 근사한 카페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송정을 거쳐 당도하는 미조항은 남해의 최남단이다. 여기서 3번 국도와 19번 국도가 출발한다. 미조에서 출발한 3번 국도는 사천, 김천, 문경을 지나 북한 땅인 초산까지 이어진다. 19번 국도는 원주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3번 국도를 따라 동쪽 해안을 따라가는 구간은 남해에서 가장 고즈넉한 길이다. 때이르게 피어난 벚꽃이 눈처럼 분분히 날리고 있는 이 길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가 마을들은 고요한 봄의 정취로 가득하다. 특히 창선도가 마주 보이는 금천마을부터는 드넓은 갯벌과 따스한 봄볕 속에서 갯것을 캐는 주민들의 모습이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 앵강만, 고향의 바다를 굽어보다 남해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봄바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앵강만이다. 남해의 지형을 흔히 나비의 모습으로 비유하는데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 공간이 바로 앵강만이다. 앵강만은 금산과 설흘산, 호구산을 두르고 있는 아늑한 바다다. 환한 봄볕 아래 코발트 물빛의 앵강만에서는 단박에 ‘고향의 바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고향이 굳이 남해가 아니래도, 바닷가 마을이 아니래도 앵강만이 보여주는 건 바로 ‘고향바다’다. 그 바다는 유순하고 부드럽고 또 푸근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바삐 지나치는 외지인들은 잘 알아채지 못한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경관이 없는 탓이다. 하지만 뒷짐 지듯 느긋한 자세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비로소 앵강만의 푸근한 아름다움이 보인다. 외지인들에게 남해라면 대표적인 관광지인 금산의 보리암이나 가천의 다랭이마을을 가장 먼저 짚지만, 남해 사람들은 십중팔구 앵강만의 바다를 첫손으로 꼽는다. 그러니 앵강만을 끼고 홍현마을에서 월포의 몽돌해안을 지나 벽련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지날 때 되도록 속도를 늦춰 보길…. 앵강만의 바다쪽 끝에 그 섬이 있다. 삿갓 모양의 작은 섬 노도다. ‘구운몽’ ‘서포만필’을 지은 서포 김만중이 300여 년 전 손바닥만 한 이 섬에 귀양와 살다가 3년 만에 쉰여섯의 나이로 죽었다. 남해는 유배지 중의 유배지였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확인된 남해 유배객들만 184명. 그중에서도 김만중은 가장 깊은 섬으로 유배를 당했다. 다리가 놓이긴 했으되 남해는 섬이다. 김만중은 배로 남해로 건너와 또다시 배를 타고 ‘섬 속의 섬’인 노도에 갇혔다. 남인과 서인의 치열한 정쟁. 그 와중에 옳다고 믿는 일이라면 한치도 물러섬 없이 목숨을 건 탄핵도 마다하지 않았던 김만중은 여기 노도의 작은 초가에서 유배됐다가 세상을 버렸다. 그가 이 작은 섬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건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병자호란의 와중에 남편을 잃고 배 안에서 김만중을 낳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헌신했던 어머니. 김만중은 유배 중에 세상을 뜬 어머니의 임종도, 장례도 지키지 못했고, 그건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깊은 그리움과 회한으로 남았다. 고향의 바다 앵강만, 그리고 그 바다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유배객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노도가 떠있다.
노도에 다녀올 이유는 거기 복원된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했던 자취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애초에 노도에 들어갔던 건 김만중의 흔적 때문이었지만, 거기서 뜻밖에 선혈처럼 붉은 동백과 함께 화려하게 피어 꽃밭을 이룬 야생화 군락을 만났다. 마을 뒤편의 오솔길을 따라 유배터의 초가를 찾아가는 오솔길에 지천에 피어난 봄꽃 구경만으로 섬을 찾을 이유는 충분했다. 노도는 여객선이 닿지 않는다. 주민이래야 열세 가구 열여섯 명이 고작인 데다 젊은이들은 일찌감치 다 섬을 떠났으니 가장 젊은 주민의 나이가 예순여섯이다. 작은 텃밭에서 제 먹을 것이나 거두며 사는 노인들의 살림이니 어차피 드나들 일도 별로 없다. 하지만 김만중의 유배지가 복원되면서 간혹 노도를 찾아오는 이들이 있어 앵강만의 벽련마을에서 낚싯배 주인들이 돈을 받고 섬으로 건네주고 있다. 배 주인에게 왕복에 3만 원 정도만 쥐어주면 벽련마을에서 노도까지 건너갈 수 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楚辭_09 (0) | 2013.04.11 |
|---|---|
|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_08 (0) | 2013.04.10 |
| 백두대간 협곡 순환 열차 (0) | 2013.03.31 |
| 楚辭_08 (0) | 2013.03.30 |
|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_07 (0) | 2013.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