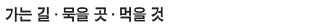|
강원도 홍천은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 정선군의 땅에다 대전시의 넓이쯤을 보탠다 해도 홍천의 땅넓이에는 한참 모자란다. 이 넓은 홍천 땅을 다 휘감고 홍천강이 흘러내린다. 강은 홍천의 중심이자 젖줄이다. 홍천이 홍천강이고, 홍천강이 곧 홍천이다. 본디 강 이름은 특정 지역의 지명을 쓰지 않는 법이다. 강줄기가 무시로 시·도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물길에다 이쪽의 지명을 붙일 수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홍천강은 어찌된 셈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홍천강을 이루는 물길은 모두 홍천 땅 안의 지천들이다. 다른 지역에서 흘러 들어온 물길이란 없다. 순전히 홍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홍천 땅으로만 흐르다가 북한강의 청평댐에 담긴다. 홍천 주민들은 다 그 강물을 먹고 산다. 제 땅에서 시작하고 흘러내려, 그 땅 안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강. 그래서 홍천이란 지명 그대로를 강 이름으로 삼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 홍천강이 지명을 강이름으로 삼은 이유 홍천강의 물길을 따라가기에 앞서 뜬금없는 영화 얘기부터. 꼭 10년 전 김기덕 감독에게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사마리아’.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예외 없이 불편하고 논쟁적이었다. 딸 또래의 여자에게서 욕정을 느끼는 파렴치한 세상에 대한 절망 혹은 구원과 속죄를 얘기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딸의 원조교제를 목격한 뒤 보복 살인을 저지른 아버지가 함께 여행을 떠난 딸에게 핸들을 쥐여주고 운전을 가르쳐준다. ‘자, 이제부턴 혼자 가는 거야.” 그 배경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강. 스크린에 등장하는 그곳이 바로 강원 홍천군 서면 반곡리 일대의 홍천강이다. 영화 속에서 죄를 씻어내는, 혹은 상처를 치유하는 건 물이고 강이었다. 홍천군청에서 만난 한 공무원의 귀띔. “김기덕 감독이 11년 전쯤에 홍천의 내촌면 쪽에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영화 ‘사마리아’도 나왔지요. 왜 그 아버지와 딸이 여행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 말이에요.” 굳이 영화의 배경이 아니었대도 홍천강은 다른 강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다. 우선 홍천강은 그 자체로 본류이자 지류다. 내촌천, 풍천천, 덕치천, 오안천, 성동천, 중방천…. 지류의 샛강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물줄기들을 다 합쳐서 홍천강으로 부른다. 홍천강은 또 여름날에 풍덩 뛰어들어 시원하게 멱을 감을 수 있는, 몇 안 남은 강 중 하나다. 강물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물살에 견지낚시를 드리우거나, 떠들썩하게 천렵을 할 수 있는, 강변의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여름 한낮 혼곤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강이다.
# 홍천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 홍천강을 이루는 ‘첫 물’을 찾아가는 길. 홍천강의 발원지는 미약골 계곡이다. 행정구역으로는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홍천에서 구룡령으로 이어지는 56번 국도변에 홍천강 발원지로 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 길옆에 아치형의 작은 문을 내고 ‘미약골 테마공원’이란 이름표를 달아놓고 있으니 찾기 쉽다. 미약골 계곡은 습기 가득한 원시림의 숲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계곡은 15년간 지연휴식년제로 통제됐다가 2012년에야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린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은 뜸한 편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분명하다. 사실 이 계곡에는 트레킹 코스 끝의 ‘암석폭포’를 빼놓고 나면 시선을 사로잡거나 탄성을 지를 만한 지연경관은 없다. 미약골 입구에 세워놓은 홍천강 발원지 표지석에는 ‘기기묘묘한 바위가 아름다운 미약골’이란 전임 홍천군수의 글을 새겨두었지만, 계곡을 따라 잘박거리며 물길을 올라가는 내내 대체 어떤 바위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바늘 하나 꽂을 틈 없는 미로의 숲을 기대했지만, 미약골 계곡을 따라가는 숲은 단일 수종의 조림된 숲처럼 빽빽하지 않다. 그늘은 축축하고 어둡고 나무와 나무 사이로, 혹은 나무와 덩굴 사이는 바람이 무시로 지날 정도로 좀 성글었다. 사람의 간섭 없이 서로 다른 수종의 나무들이 제각기 자기 자리를 지키며 우거지는 원시의 숲은 본디 이런 모양이었을까. 이 숲길에서는 경관이 아니라 숲의 깊이를 느껴볼 일이다. 미약골 계곡을 즐기려면 눈이 아니라 오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지워져 있던 동안 계곡은 축축한 습기를 먹고 자라는 양치식물과 짙은 이끼로 뒤덮였다. 숲으로 들어서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둥글게 백제 금관 형상으로 자라난 양치식물, 관중이다. 계곡에서 숲길로 올라서면 두 뼘 남짓의 탄성 있는 오솔길 양쪽을 온통 관중이 뒤덮었다. 그 위로는 물푸레나무와 신나무, 느릅나무의 뒤틀린 가지들이 서로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얽혔다. 숲이 뿜어내는 향기는 짙었고, 나무들은 둥치마다 초록의 이끼를 두르고 있다. 짙은 채도의 초록 이끼는 계곡 바위벽 하나를 다 뒤덮기도 했다. 계곡 초입에서 암석폭포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는 1.8㎞ 남짓. 왕복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다. 트레킹 코스는 물길을 끼고 이어진다. 이즈음 홍천 일대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쪽의 계곡은 맑은 물이 찰랑거린다. 한강의 검룡소나 낙동강의 황지, 금강의 뜬봉샘처럼 홍천강의 시작도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이다. 미약골 계곡은 길이 있는 듯 없는 듯하다. 한 뼘의 나무 덱도 밧줄 하나도 없는 길은 먼저 오른 사람들이 디딘 발자국만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도 장마철에 큰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트레킹이란 그때그때의 수위에 따라서, 또 오르는 이의 작정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법. 수위가 낮을 때면 계곡 양쪽의 바위를 그냥 딛고 오르지만, 물이 많고 소(沼)가 깊어지면 별수 없이 계곡의 가파른 사면을 치고 올라야 한다. 처음부터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적실 작정이라면 그냥 잘박거리는 물로 걸어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마른 신발로 오르려면 협곡이 좁아질 때마다 산기슭을 에둘러 돌아가야 하니 숨이 가쁘다. 길이 흐려지는 지점쯤에는 누군가 드문드문 노란 리본을 매달아놓았다. 길이 끊겼다 싶을 때 찬찬히 둘러보면 길이 있지만 그걸 찾지 못한대도 상관없다. 계곡 옆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 가면 그뿐이다. 그렇게 딛고 오른 자리는 뒤에 오는 이들에게는 길이 된다.
# 폭포 너머 첫 물이 시작되는 자리에 서다 계곡을 건너고, 숲길을 에둘러 미약골을 오르다보면 트레킹 코스의 종점에 암석폭포가 있다. 미약골이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보이는 자리다. 여기까지 오를 동안 계곡의 물은 순하디 순하다. 물소리는 동행한 이와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작고 나지막하다. 때로 물굽이가 유순해지는 구간에서는 물소리 대신 새소리만 계곡에 가득할 뿐이었다. 길 끝의 폭포마저도 물소리가 부드럽다. 폭포에 가까이 다가섰음에도 귀만으로는 거기 폭포가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으르렁거리며 포효하는 힘찬 폭포를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늘하늘한 커튼처럼 분무하듯 쏟아지는 부드러운 폭포의 물줄기는 그것대로 자못 색다른 느낌이다. 대개 폭포 앞에 서면 요란한 물소리로 가슴까지 두방망이질치는 법인데, 이 폭포 앞에서는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다. 폭포 아래 옥빛의 소를 마주 보는 바위에 걸터앉아 폭포수가 물 커튼처럼 쏟아지는 경관을 오래 바라보았다. 미약골의 트레킹 코스는 여기까지니 이쯤에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발길을 되돌리기가 아쉽다. 폭포로 쏟아지는 물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것일까.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이 깊은 산중 어디쯤에 있는 것일까.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폭포 위로는 화전민들이 나물과 약초를 캐고 살았다는 깊은 땅 ‘마당대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당대기 위쪽에 물이 나는 늪인 ‘진펄’이 있다고 했다. 거기가 바로 홍천강의 뿌리라고 했다. 폭포 위로 올라섰다. 길은 일찌감치 사라졌고, 물푸레나무와 신갈나무 우거진 숲은 더 깊어졌다. 이윽고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마당대기는 왼쪽 물길 끝에 있다고 했다. 살아서 계곡의 비탈진 사면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가 죽어 계곡 쪽으로 넘어진 고목들이 짙은 이끼에 뒤덮여 자주 길을 막는다. 이윽고 길은 더 가팔라졌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설명대로 낙엽송 울울한 숲이 나타났다. 1960년대 말인지, 1970년대 초인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주민들은 그 무렵 화전민의 이주가 있고 나서 그 자리에다 낙엽송을 심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거기가 화전민들이 모여 살았다던 ‘마당대기’였다. 제 땅 한 뙈기 없이 가난으로 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 했던 화전민들의 고단한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진펄’이라고 부르던 늪은 마당대기에서 더 올라간 자리에 있었다. 한강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소처럼 맑은 물이 콸콸 솟아 흐르는 것도 아니고,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처럼 그득히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발밑으로 느껴지는 물컹거리는 느낌만이 거기서 물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렇게 발밑에 고인 물이 ‘첫 물’이 돼서 폭포가 되고 홍천강이 되고 다시 청평댐에 담겼다가 한강이 돼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18 (0) | 2014.07.12 |
|---|---|
| 초호화 풀빌라 7곳 (0) | 2014.07.09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17 (0) | 2014.06.24 |
| 35번 국도길에 반하다 (0) | 2014.06.20 |
| 허시명의 우리술 이야기_03 (0) | 201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