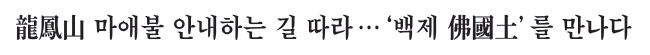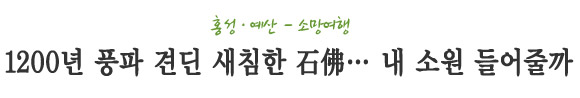 |
신라 말엽 혼란의 시기. 백제 멸망 이후 홍성과 예산을 비롯한 충남의 서쪽, 이른바 ‘내포지방’ 사람들이 전쟁과 학정의 그 고된 삶을 견뎌냈던 건, 희미하긴 해도 결코 꺼뜨리지 않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내포지방의 불국토를 이뤘던 용봉산의 석불들이 그 희망을 증거합니다. 산중에 들판에 저잣거리에 세워진 미륵에서, 이제는 풍화돼 다시 돌로 돌아가는 석불에서 그 희망을 읽습니다. 용봉산의 골짜기마다 스물일곱 개나 되던 옛 절이 스러지고 나서 그 터에 버려진 불상은 그대로 미륵이 됐습니다. 부처의 열반 이후 56억7000만 년 후에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해 준다는 미륵. 삶에 지친 이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그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용봉산의 절집 아래서 만난 석불이 각별했던 건, 그 얼굴이 두루뭉술 판에 박은 불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톰한 눈두덩과 가는 눈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 떠올려집니다. 희망은, 그리고 구원은 이렇듯 구체적이었을 겁니다. 신년 벽두에 홍성과 예산 땅으로 미륵을 찾아가는 여정을 권합니다. 미륵을 기다렸던 옛사람들처럼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희망 하나만 품고 산다면 세상살이는 따스해지는 법이니까요.
# 56억7000만 년의 희망을 찾아가는 길 화염처럼 치솟은 충남 홍성의 용봉산 암봉 아래 자그마한 절집에서 스님이 내놓은 향긋한 다래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덥히고 내려서는 길. 바위 틈에 숨은 듯 서있는 그 부처를 만났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석공이 돌 속에서 꺼낸 부처. 갸름한 얼굴에다 도톰한 눈두덩과 가는 눈. ‘다 똑같이 생긴’ 다른 불상과는 사뭇 달랐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에 그 앞에선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저렇듯 새침한 표정으로 받아냈으리라.
미륵은 석가모니가 미처 구원하지 못한 중생들을 훗날 구원키로 약속받은 미래불이다. 신라 고승 원효의 계산법에 따르면 미륵은 부처가 열반에 들고난 뒤 자그마치 56억7000만 년 뒤에 도솔천을 건너 세상에 오기로 예정돼 있다. 세상에 와서 용화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돼 세 번의 설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해 준단다. 미륵의 도래를 믿은, 후세의 구원을 믿은 이들이 이 수많은 미륵불을 세웠을 것이다. 미륵불을 세우고 그 앞에 두 손을 모으며 미래 세상에서 올 구원을 기다렸다는 건, 역설적으로 질곡 같은 삶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래의 구원을 간절히 기원했던 건,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홍성과 예산은 인근의 서산과 태안을 함께 묶어 ‘내포(內浦)지방’이라고 부른다. 내포란 바다가 육지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온 지역이란 뜻. 이쪽에 미륵이 가장 많이 세워졌던 건 신라 말엽 때다. 덧없이 스러지고만 백제가 거기 있었다. 통일 신라 이전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이었던 내포지방에는 전란이 끊이질 않았다. 후삼국의 전쟁도 이쪽이 주무대였다. 끝을 모르는 기나긴 전쟁의 복판에서 살았던 내포 사람들은, 그러나 희망을 믿었다. 그래서 언젠가 미륵이 내려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00년. 이 땅의 삶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어지럽다. 이루지 못한 꿈과 욕망, 그리고 미래 세상의 구원의 꿈은 아직 여전하다. 신년 벽두의 여행지로 내포의 미륵불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권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소원은 소박하면 소박할수록, 그 소원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로 향하는 것일수록 그 여정은 더 따스하고 값지리라. # 용봉산, 패망한 백제의 불국토를 이루다 내포지방의 미륵을 만나러 가는 여정의 중심은 마땅히 홍성 땅의 용봉산이 돼야 한다. 높이래야 해발 381m에 불과하지만, 용봉산은 능선을 따라 창처럼 세워진 기암이 늘어서 있어 한눈에도 범상찮은 기운을 뿜어내는 산이다. 산 이름에다 용(龍)과 봉황(鳳)을 함께 넣은 것만으로도 비범한 산세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투석봉, 노적봉, 악귀봉, 병풍바위…. 일일이 이름을 외자면 숨이 찰 정도의 암봉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용봉산의 능선은 북쪽으로 예산의 수암산으로 이어진다. 암릉의 줄기는 수암산으로도 넘어가 비경을 빚어내는데, 수암이란 이름도 ‘빼어날 수(秀)’에 ‘바위 암(巖)’자를 쓴다.
먼저 산행 코스를 따라 용봉산 남쪽 아래부터 시작하자. 산행 들머리가 되는 절집 용도사에는 당당한 체구의 상하리미륵불이 우뚝 서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각진 얼굴의 불상은 높이가 7.7m, 어깨 폭도 4m에 달한다. 미륵불 바로 옆에 대웅전이 있는데도 주지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법당을 놔두고 미륵불 앞에서 예불을 시작했다. 후덕한 표정의 석불에서는 위압감보다 소박함이 느껴졌다. 금세라도 기도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 것 같은 그런 인상이다. 용봉산 남쪽 끝에 상하리미륵불이 있다면, 반대편 북쪽 예산의 수암산 자락에는 삽교석조보살입상이 있다. 두 개의 돌을 붙여서 세운 이 미륵불도 키가 8m에 달한다. 이 미륵불은 홍성의 상하리미륵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홍성의 것이 두꺼운 몸매에다 다소 무뚝뚝한 인상이라면, 예산의 것은 키만 훌쩍 큰 여윈 체격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좀 불경스러울지는 몰라도 두 미륵불을 한꺼번에 이르자면 이런 표현이 딱 적당하겠다. 뚱뚱이와 홀쭉이…. 남쪽 끝과 북쪽 끝에 하나씩의 미륵이 있다면 산의 가운데쯤에는 관음보살이 있다. 용봉산과 수암산 능선의 딱 중간쯤에 있는 절집 용봉사. 그 위쪽에는 신경리마애여래입상이 있다. 바위면을 파내고 그 안에 불상을 돋을새김했는데 유연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이 불상은 앞으로 기울여 조각돼 있는데, 그 앞에 서서 불상과 눈을 맞추면 왜 애써서 이렇게 기울여 조각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다. 용봉사 아래쪽에도 바위에 글과 함께 새겨놓은 마애불이 또 하나 있다. 기사 첫머리에서 소개한 그 불상이다. 용봉사의 석불 중에서 유일하게 조성한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미륵불이다. 미륵불을 새긴 건 신라 말인 799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1215년 전의 일이다. # 미륵의 하생을 기다리던 간절한 기원 용봉산의 빈절골에도 마애보살입상이 있다. 인적이 없는 계곡의 무성한 조릿대 덤불을 뚫고 이정표 하나 없는 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산중을 헤매다가 넓적한 바위에 얕게 돋을새김돼 있는 불상을 찾았다. 꾹 다문 입에 한 손을 들고 있는데, 자취 없는 담쟁이 덩굴이 허리춤을 휘감고 있다. 그 위쪽으로 빈절골의 옛 절터가 있다는데, 도무지 길이 없어 접근이 불가능해 발길을 되돌렸다. 빈절골 아래에도 가마바위골 절터가 또 있다고 전해진다. 거기서 불상과 석탑이 몇 개 무단으로 반출됐고, 30년 전쯤 발견된 머리가 없는 불상은 공주박물관 야외전시장으로 옮겨졌다. 그것 말고도 용봉산 아래에 있었다던 27개의 옛 절터마다 불상이나 석탑을 모셔 두고 있었을 터이니 얼마나 많은 불상들이 실려 나갔던 것일까. 도난당한 석불이라면 홍성의 용산리미륵불을 빼놓을 수 없겠다. 강인한 인상의 이 석불은 길가의 언덕 위에 벽돌담을 두른 채 서있는데, 지난 1989년 감쪽같이 도난당했다가 한 달여 만에 되찾았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07 (0) | 2014.01.13 |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2 (0) | 2014.01.10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06 (0) | 2014.01.01 |
| 시와 함께하는 우리 산하 기행_29 (0) | 2013.12.26 |
| 새해 달력에 표시해야 할 그곳 (0) | 201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