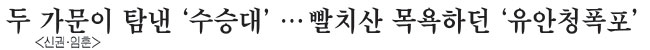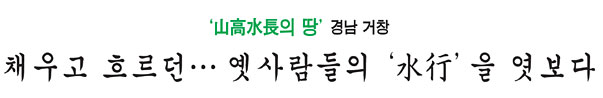 |
산 깊으면 물 또한 좋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을 비롯해 해발 1000m가 넘는 16개의 거대한 산군(山群)을 주위에 병풍처럼 거느리고 있는 경남 거창. 그곳을 일러 ‘산고수장(山高水長)’의 땅이라 합니다. 산(山)은 높이(高) 솟았고 물(水)은 길게(長) 흐르는 고장이란 얘기지요. 거창 땅 곳곳에는 그늘 어두운 계곡이 즐비하고 그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산자수명한 땅에 기암괴석을 굽이치는 물은 옛 선비들에게 자연의 풍류를 넘어 ‘마땅히 가져야 할 덕(德)과 학문’으로도 읽힙니다. 중국 고전 ‘맹자’에 이르기를 “물은 웅덩이를 다 채우고서야 비로소 흘러간다” 했으니 곧 학문이 제 안을 가득 채운 뒤에야 물길처럼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산고수장’이란 말도 사실 산과 물의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문과 덕행이 높고 길게 이어진다’는 뜻으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거창 땅의 풍광 좋은 물가에 예순여덟 개나 되는 정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흐르는 물로써 마음을 닦았던 옛 사람들의 오롯한 정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거창에는 벼슬과 출세보다는 자연에 더 마음을 두었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요수(樂水) 신권과 갈천(葛川) 임훈. 거창에 가겠다면 굵게 밑줄을 그어둘 인물입니다. 처남매부지간이었으되 서로 경쟁했던 두 가문의 선비는 어지러운 세상사에서 한발 비껴앉아 거창의 월성계곡과 위천의 물가에서 자연과 벗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요수는 끝내 관직에 나가지 않았고, 갈천은 벼슬을 했지만 이렇다 할 관직을 맡았던 건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물러나 맑은 자연 속에서 머물며 흐르는 물에 마음을 닦았던 것이지요. 말년을 자연에 의탁한 거창 사람으로는 또 동계(桐溪) 정온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이마를 땅바닥에 박아 피를 철철 흘리며 기어가는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걸 목격하곤 자신의 배를 칼로 찔렀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남은 여생을 거창의 깊은 산에 의탁해 은거하다 세상을 떴습니다. 요수와 갈천, 그리고 동계. 그러고 보니 이들 셋의 호(號)에는 다 물의 기운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지나간 자취 위로 물은 다시 웅덩이를 다 채우고 넘쳐 흘러갑니다. 거창에서 무릇 보아야 하는 것은 자연의 경관에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거창 땅 도처에서 만나는 그윽한 계곡과 빼어난 정자, 굽이치는 물가의 짙고 어둑한 숲에서 마주치는 것은 조화로운 자연이 종래에는 삶의 이치와 닿아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거창에서 가장 첫손으로 꼽히는 명승은 예나 지금이나 단연 거북형상을 한 바위 수승대다. 수승대 일대의 아름다움은 유연한 자연스러움에 있다. 거창 땅을 가로지르는 위천의 물줄기가 수승대에 이르러 널찍한 화강암을 타고 넘으면서 넓은 반석을 펼쳐놓는다. 명승이라지만 수승대는 기기묘묘한 절경의 긴장감보다는 느슨하고 부드러운 쪽에 더 가깝다. 너럭바위를 타고 넘는 물소리마저 낮고 부드러운 곳. 그야말로 ‘모난 곳’이 하나 없는 풍경이다. 어지러운 세상사에서 한발 물러서 물 흐르듯 마음을 닦기에 여기만 한 곳이 또 있었을까. 수승대의 본래 이름은 수송대(愁送臺)였다. 여기는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지역이었다. 여기서 백제가 쇠락해가던 때 신라로 가는 사신을 근심으로 보냈다 해서 근심 수(愁)에 보낼 송(送)자를 썼다. 그러나 장인 회갑을 맞아 거창의 처가를 찾아온 퇴계 이황이 십리 밖에서 얘기만 듣고 ‘무슨 그런 우울한 이름을 쓰느냐’며 시를 지어 바꿔 부른 이름이 수승대(搜勝臺)였다. 퇴계는 수승대를 가보려 했으나 급작스러운 임금의 부름으로 기회를 놓쳤다고 전한다. 시 한 수로 이름은 바꿨으되, 퇴계는 아쉽게도 생전에 한 번도 이곳에 걸음하지 못한 셈이다. 거북바위의 수승대 풍경이 각별한 것은 거북과 빼닮아서가 아니라, 커다란 바위 사방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새겨놓은 글귀 때문이다. 시구절도 있지만 바위에 새겨진 건 대개가 이름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 새겨진 이름의 태반이 임씨 아니면 신씨다. 이제 거창 땅의 두 선비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요수(樂水) 신권과 갈천(葛川) 임훈. 인근마을의 처남매부지간이었던 두 선비는 자연 속에 은거하며 후학들을 키워냈다. 이 둘은 학문으로도 교분이 깊었던 모양인데, 정작 후손들은 수승대를 놓고는 서로 제 집안의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았다. 수승대에는 퇴계의 시를 새겨두었는데 임씨 문중에서 그 옆에 갈천의 시를 새긴 것이 분란의 시작이었다. 이걸 보고 못마땅해한 신씨 집안에서는 바위에 ‘요수 선생이 수양한 곳’이란 글귀를 새겼고, 이에 질세라 임씨 집안에서는 ‘갈천 선생이 노닐던 장소’라는 글을 새겨넣었다. 그러자 신씨 집안은 아예 바위 아래에다 마치 묘갈비처럼 자손과 종족의 이름을 세세히 새겼고, 임씨 집안도 따라 새기게 됐다. 그러다 보니 바위는 온통 신씨와 임씨 후손의 이름으로 뒤덮이게 됐다. 급기야 두 집안에서는 거북바위를 놓고 수십 년에 걸친 소유권 소송을 벌였는데 양쪽 집안이 적잖은 재산을 탕진하게 됐다고 전한다. 소송의 판결은? 당연히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소송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지금 수승대의 주인은 단연 요수 신권이다. 수승대 앞에 새겨진 연반석(硯磐石)이란 글자는 그의 제자들이 먹을 갈던 바위란 뜻이고, 세필짐(洗筆)은 붓을 씻던 자리란 의미다. 물살이 깎아내 만든 동그란 바위 구멍은 막걸리 한 말을 넣어두고 스승에게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한 사발씩 마셨다고 해서 장주갑(藏酒岬)이라 불린다. 수승대가 내려다보이는 물가에 바위를 초석삼아 올린 정자 요수정도 요수가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고, 물 건너 수승대 뒤쪽 구연서원도 제자를 가르쳤던 서당 자리에 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요수정에 올라 소나무 숲 사이로 수승대를 굽어보노라면 번잡스러운 세상에서 발을 빼고 흐르는 물처럼 덕과 학문으로 자신을 채우기에 힘썼던 옛 선비의 맑은 마음이 느껴진다. 구연서원에서는 정문 격인 관수루를 유심히 살펴보자. 관수(觀水). 즉 ‘물을 본다’는 뜻의 현판 이름은 중국 고전 ‘맹자’에서 따온 것.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흐르는 물처럼 학문을 닦는다는 뜻이겠다. 문루 앞쪽은 곧은 나무를 주춧기둥으로 썼지만, 뒤편은 휘어진 나무를 베어 그대로를 기둥으로 삼았다. 휜 나무를 곧게 다듬지 않고 자연스레 기둥으로 삼은 지은이의 내공이 거기서 학문을 닦던 유생들의 학식보다 못할 게 없다. 수승대가 요수의 것이라면, 인근의 갈계숲은 갈천의 것이다. 숲은 수령 200∼300년의 느릅나무와 소나무, 물오리나무, 느티나무로 이뤄져 있다. 갈계숲과 숲이 있는 마을, 갈계리라는 이름 모두 임훈의 호 ‘갈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갈계숲에는 갈천의 후손들이 비교적 근래에 세운 3개의 정자가 나란히 있다. 그다지 크지 않은 하나의 숲에 정자 셋을 두고 있는 곳은 여기 말고 본 기억이 없다. 신선이 놀고 싶을 만큼 아름답다는 가선정은 갈천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34년 지은 정자다. 선비의 기상이 물씬 풍기는 도계정은 갈천의 아우인 도계 임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것. 여기서 눈 여겨볼 것이 가장 자그마한 정자인 병암정이다. 규모는 자그마하지만 단정한 자태에 금세 마음이 끌린다. 이 정자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은 천장이다. 소박한 겉모습에 끌려 정자 안으로 들었다가 천장을 올려다보곤 깜짝 놀랐다. 나무를 길게 쪼개서 촘촘하게 방사형으로 천장을 덧댄 위에다 다양한 색감의 문양과 그림을 그려넣었는데 그 화려함에 절로 탄성이 터졌다. 갈계숲을 끼고 있는 갈계마을에는 또 갈천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둘째 아우와 함께 건립한 갈천서당과 임훈이 살던 집인 거창 갈계리 임씨고가를 비롯해 갈천이 생전에 받은 효자정려와 사당 등의 유적이 즐비하다.
거창의 차고 맑은 물은 금원산의 깊은 산중에도 차고 넘친다. 금원산 휴양림에서 포장도로를 따라 오르다 보면 길은 유안청계곡과 지재미골로 갈린다. 두 계곡은 어디가 더 낫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수려하다. 먼저 유안청계곡. 짙고 깊은 골짜기를 10분쯤 걸어오르면 유안청폭포를 만난다. 시경(詩經)에 등장하는 ‘유안(儒案)’은 유생을 달리 이르는 말. 유생들이 과거급제를 목표로 공부했던 공부방을 ‘유안청’이라 했다. 폭포 부근에 가섭사란 옛 절집이 있어 ‘가섭연폭’이라 했던 폭포이름은 절터에 유생들의 공부방이 들어서면서 유안청폭포로 바꿔 붙여졌다. 유안청폭포는 두 개다. 휴양림의 들머리에서 산길로 350m쯤 걸어들어가면 먼저 만나는 게 비스듬히 누운 와폭이다. 우람한 직폭은 그 너머의 숲 뒤로 저만치 물러서 있다. 대개 하류 쪽 와폭이 아닌 뒤쪽의 직폭을 유안청폭포라 부른다. 하늘을 가릴 듯한 숲 사이에서 폭포수가 부챗살처럼 물살을 퍼뜨리며 쏟아지는데 폭포 위쪽은 짙은 숲으로 가려져 턱밑까지 다가가야 겨우 폭포의 높이가 가늠이 된다. 어두운 숲 사이로 폭포는 떨어지고 그 폭포의 포말 위로 햇볕이 다시 떨어져서 물줄기가 마치 형광등을 켠 듯 순백으로 환하다. 폭포 앞에 서면 숲의 어둠과 물의 환함이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태가 쓴 ‘남부군’에는 기백산 북쪽 이름없는 골짜기에서 500여 명의 빨치산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유안청폭포가 바로 거기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楚辭_14 (0) | 2013.06.17 |
|---|---|
| 황교익의 味食生活_30 (0) | 2013.06.15 |
| 평화 공존 꿈꾸는 경계의 땅 "대마도" (0) | 2013.06.07 |
| 고연희의 옛 그림 속 인물에 말을 걸다_12 (0) | 2013.06.06 |
| 楚辭_13 (0) | 2013.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