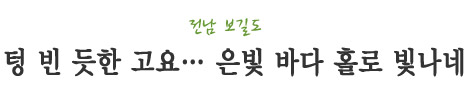 |
전남 완도군의 보길도. 340여 년 전에도, 또 지금도 그 섬의 주인은 고산 윤선도입니다. 당쟁과 사화로, 또 잇따른 전란으로 어지러웠던 세상을 등지고 절해고도로 들어왔던 그는 이 섬에다 꿈에 그리던 이상향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막아 그 가운데 그윽한 정취의 정자를 세웠고 마을이 바라보이는 산 중턱에 서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은둔하며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자취가 지금도 보길도 부용동에 고스란히 되살려져 있습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 남도의 섬, 보길도로 갑니다. 보길도는 여전히 윤선도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보길도에 윤선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즈음 보길도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윤기로 반짝이는 난대림 초록 숲. 밭두둑에서 벌써 간질간질 올라오는 냉이와 쑥. 섬 곳곳에서 막 붉게 피어 하나둘 떨어지는 동백…. 활처럼 둥글게 휘어진 통리와 중리의 해변은 일출 무렵의 여명으로 붉게 물들었으며, 섬 남쪽의 능선을 걸어 당도하는 해안 절벽 ‘돛치미 끝’의 바다는 한낮의 햇살을 받아 온통 은박지처럼 반짝였습니다. 예송리 해변에는 파도에 떠밀린 자갈이 달빛 희미한 깊은 밤에도 자그락거렸습니다. 겨울이면 보길도는 외지인들의 발자취가 끊겨 텅 비어 고요해집니다. 드나드는 파도소리만 남은 적막한 섬에서 세상에 등 돌리고 은거했던 섬 주인의 향기는 한결 더 짙었습니다.
# 난대림의 숲에서 뚝뚝 떨어지는 동백 “간밤에 눈 갠 후에 시절 따라 경치가 다른고야 / 이어라 이어라 / 앞에는 온 세상이 유리같이 언 바다, 뒤에는 눈에 천 겹으로 둘러싸인 백옥의 산 / 삐걱삐걱 어사화 / 선계(仙界)인가 불계(佛界)인가 인간세상이 아니로다.”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동사(冬詞) 중에서 전남 완도의 화흥포항에서 차를 배에 실었다. 마침 조류가 거의 없는 ‘무쉬’ 물때다. 바다는 장판지처럼 고요했다. 양식장 부표와 지주식 감발 사이를 헤치고 보길도로 가는 바닷길. 고산 윤선도는 어부사시사에서 겨울 보길도의 ‘유리같이 언 바다’와 ‘눈이 겹겹이 쌓인 산’을 노래했지만, 거울 같은 남쪽 바다를 미끄러지는 청해진카페리호의 갑판 위는 봄볕같이 따스한 햇살로 환했다. 페리호 난간에 기대 옥빛 바다를 바라보노라니 겨우내 단단한 긴장으로 뭉쳐 있던 몸과 마음의 근육이 절로 녹신녹신 풀어지는 것 같았다. 치열한 당쟁의 와중에 일생을 거의 유배지와 절해고도에서 보냈던 고산 윤선도. 보길도는 누가 뭐래도 윤선도의 섬이다. 진도와 완도 일대 섬의 간척으로 엄청난 부를 일궜던 해남 윤 씨 가문의 재력을 바탕으로 윤선도는 세상을 등지고 보길도로 들어와 도합 13년을 은둔하며 기막힌 정원과 거처를 꾸렸다. 그의 행적을 두고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섬으로 들어가 혼자만 유유자적했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가 외딴섬에 꾸며놓은 정원의 풍류와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계곡수를 받아내 만든 유려한 연못 곁에 세워놓은 세연정이 그렇고, 부연동의 굽어보는 자리의 동천석실도 그렇다. 최근 복원해 옛맛은 없지만 낙서재와 곡수당의 자리도 모자람이 없다. 겨울 보길도는 텅 비어 있었다. 완도의 화흥포와 해남의 땅끝항까지 거의 한 시간에 한 대씩 카페리호가 오가지만, 겨울에 페리호는 승객보다는 전복을 실으러 들어오는 대형 활어차들 차지다. 드나드는 이가 없는 겨울은 보길도가 한 해 중 가장 고요한 때다. 섬의 풍경에서 계절은 잊힌다. 섬 여기저기서 자라는 붉은 정념의 동백만 저 홀로 꽃을 후두둑 떨군다. 난대림의 숲도, 자그마한 밭두렁도 온통 평화로운 초록빛으로 가득하다. 밭 아래는 지난가을부터 피고 지던 보랏빛 해국이 지지 않고 여태 남아 꽃을 피우고 있다. 볕이 좋은 날에는 바닷바람도 그 끝이 차거나 맵지 않다.
# 풍류와 묵향이 그윽한 곳…부용동 완도 화흥포에서 뜬 배는 보길도가 아니라 노화도의 북쪽 동천항에 닿는다. 노화도까지 가서 보길대교를 건너 보길도로 들어가야 한다. 보길도와 노화도 사이에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여객선이 보길도에 직접 닿았는데, 지금은 육지에서 좀 더 가까운 노화도까지만 운항한다. 노화도에서 가장 큰 항구는 이목항, 보길도에서는 청별항이다. 이 두 항구는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데 보길대교가 이 두 항구를 잇는다. 보길도의 청별항은 여기서 윤선도가 찾아온 손님을 떠나보냈다고 해서 ‘맑은(淸) 이별(別)’이란 제법 서정적인 이름을 얻었다. 항구에는 바다를 끼고 그만그만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1층은 횟집으로 2층은 민박을 놓은 집들이 대부분이다. 여름은 물론이거니와 봄부터 가을까지도 제법 북적거리지만 이즈음에는 문 연 집을 찾아가보기 어렵다. 노화도에서 보길도로 건너가면 열이면 열, 모두가 윤선도의 자취를 따라 부용(芙蓉)동부터 찾아간다. 뒤에 두고 있는 격자봉을 중심으로 산들이 둘러치고 있는 꽃술 형상의 자리. 그래서 마을 이름도 꽃이름인 ‘부용(芙蓉)’에서 가져왔다. 부용동은 바다 가운데 섬이면서도 바다가 보이지 않고 파도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함경도 삼수와 경상도 영덕 등 거친 유배지를 들락거리던 윤선도는 여기에 이르러 ‘선계(仙界)’라 이르고, 말년에 별장을 짓고 은둔했다. 윤선도의 자취 중에서 가장 빼어난 세연정은 부용동으로 드는 초입에 있다. 물을 받아 비정형의 연못을 만들어두고 그 가운데 앉힌 정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풍경을 즐기며 노닐었다. 모르긴 해도 보길도에서 윤선도가 남긴 어부사시사와 서른 두 편의 한시도 묵향 그윽한 세연정에서 지어 내려갔을 것이었다. 세연정의 매력이라면 문을 모두 접어 활개 치듯 위로 들어올린 모습인데, 아쉽게도 지난해 여름 태풍으로 문이 망가져 한창 보수 중이다. 연못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물길의 석축도 한꺼번에 손을 보느라 부산하다. 부용산 아래는 근래에 복원된 낙서재와 곡수당 등이 있고, 맞은편 산자락에는 ‘동천석실’이 있다. 윤선도가 생전에 은거하며 책을 읽었다는 곳이다. 이제 막 꽃을 틔우기 시작한 동백나무들이 터널을 이룬 산길을 따라 20분 정도 오르면 산 중턱에 바위 정원을 거느린 한 칸짜리 정자가 나온다. 정자에 앉으면 부용동 일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연미가 빼어난 것도 아니고 기암의 경치를 보여주는 자리도 아니지만, 부드럽고 아늑한 마을 풍경에 마음이 절로 순해진다.
# 보길도에서 만난 또 다른 삶…심원위재 보길도는 여전히 ‘윤선도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섬에 윤선도만 있는 건 아니다. 보길도에는 고암 김양재의 고택 ‘심원위재(深原緯齋)’도 있다. 지은 지 200년 남짓 된 고택인데 행랑채에 낸 문을 들어서면 ‘행율당(杏律堂)’이란 현판을 내건 사랑채 앞으로 난대림의 초록 정원이 펼쳐지는 곳이다. 마당에는 어지간해서는 보기 힘든 굵은 나한송과 그보다 더 우람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날렵한 석탑 한 기가 서 있다. 그만그만한 나한송은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굵고 풍성한 나무는 또 처음이다. 안채의 뒤쪽에도 잘 가꿔진 후원이 있다. 후원에는 완도 땅에 나뒹굴던 것을 배로 실어와 맞춘 고려 때의 부도도 세워져 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3 (0) | 2014.01.19 |
|---|---|
| 김치 유산균은 최고의 셰프 (0) | 2014.01.16 |
| 박록담 우리술 이야기_07 (0) | 2014.01.13 |
| 동양화가 말을 걸다_22 (0) | 2014.01.10 |
| 홍성,예산 소망여행 (0) | 2014.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