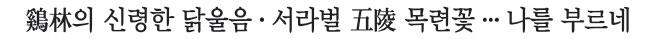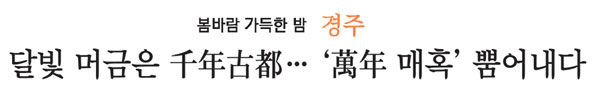 |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에서 맞이하는 봄밤. 풍경을 지우는 어둠은 때로 더 많은 것들을 매혹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등을 들고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경주의 첨성대와 월성 사이의 숲, 계림에 들었습니다. 황금 궤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신라의 신성한 숲. 그 숲에서 오래 묵은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단풍나무, 홰나무 고목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달빛으로 적셔진 숲길 위에서 이병주의 소설 ‘산하’의 서문 문장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경주에는 유독 달을 빌려 이름으로 삼은 곳들이 많습니다. 월지(月池), 월정교(月精橋), 월성(月城)… . 달빛 아래서 만날 수 있는 신화가 거기 있습니다. 경주의 봄은 도로변마다 만개한 벚꽃과 만발한 노란 유채로 화려합니다만 아는 이들은 압니다. 어둠이 도시를 지워버리고 난 뒤의 경주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말입니다. 고대 국가의 유적들이 달빛과 간접조명으로 은은하게 떠오르면 아득한 시간 너머의 서라벌 땅으로 들어선 듯합니다. 왕릉이 그려내는 부드러운 곡선 위에 조명을 받은 고목이 실루엣으로 겹쳐지고, 그 위에 봄꽃 향기가 출렁거리는 순간의 미감은 마음에 눌러 찍은 도장처럼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경주에는 봄밤을 걷는 길이 여럿입니다. 저물녘 무열왕릉 앞의 서악서원에서 대금 연주 한 자락에 향긋한 차 한잔을 곁들이고 나서 등을 켜들고 목련꽃 흐드러진 첨성대에서 동궁과 월지까지 걷는 것이 ‘신라달빛기행’의 코스입니다. 그 길에 경주의 가장 아름다운 봄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짧아서 아쉽다면 보름 밤 연분홍 벚꽃이 분분히 날리는 보문호반을 느릿느릿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경주 봄밤의 그윽함을 치장하는 꽃이 목련입니다. 화려하기로 치자면 경주에서는 벚꽃이 으뜸이지만, 교교한 달빛과 썩 잘 어울리는 꽃이라면 단연 목련입니다. 아직 벚꽃은 이르지만, 지금 경주에는 목련의 개화가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딱 1주일. 떠들썩한 벚꽃놀이 행락객이 몰려들기 직전의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경주의 봄밤 정취를 고즈넉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푸른 어둠이 공간과 시간을 지우다 경주의 봄밤은 푸른빛이다. 푸른 어둠은 때로 어지러운 풍경을 쓱쓱 문질러 지워버린다. 어지러운 풍경과 함께 지워지는 건 공간과 시간의 경계다. 그렇게 어둠으로 비워낸 자리 위에서 고대 도시 신라 서라벌의 시간이 조명을 받아 또렷하게 떠오른다. 경주에서 최고의 밤 경관을 꼽으라면 추호도 주저할 것이 없다.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떠오르는 ‘동궁’과 ‘월지’의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말이다. ‘동궁과 월지’라면 혹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안압지(雁鴨池)’란 예전 이름을 모를 리는 없다. 안압지란 이름을 두고 왜 동궁과 월지로 바꿔 부를까. 사실 안압지란 이름은 한참 뒤인 조선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폐허가 된 신라의 유적지를 찾은 조선의 묵객들이 연못 위로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모습을 두고 ‘기러기 안(雁)’에다 ‘오리 압(鴨)’을 써서 자못 서정적인 이름을 붙여줬다. 안압지가 월지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은 건 1980년 연못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나온 한 조각의 토기 파편 덕분이었다. 토기에는 ‘월지’란 이름이 선명했다. 지척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왕궁, 월성(月城)과 짝을 이루는 이름이었다. 월지(月池). 이름하여 ‘달의 연못’이다. 그래서 안압지라는 이름은 2011년부터 ‘동궁과 월지’로 고쳐 부르게 됐다. 왕자가 기거하는 별궁의 이름인 ‘동궁’에다 ‘월지’를 붙여 지은 이름이다. 달의 이름을 써서일까. 월지의 경관은 낮보다 밤이 몇 배나 아름답다. 어둠이 주위의 풍경을 다 지워버리고 누각과 연못, 그리고 신라 때 기기묘묘한 나무와 진기한 동물을 길렀다는 아름드리 숲이 푸른 어둠 속에서 은은한 조명을 받아 노란빛으로 떠오르는 모습은 자못 황홀할 정도다. 월지의 빼어남은 어느 자리에서든 그 면모를 한눈에 다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비정형의 연못과 겹쳐지는 누각의 담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온다. 접힌 가까운 풍경과 먼 풍경이 중첩되고, 조명으로 원근의 감각이 또렷해지면서 서 있는 위치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빚어내는 것이다. 푸른 어둠이 묵색으로 더 짙어지면 조명을 받은 화려한 누각이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는 자리도 있고, 아름드리나무로 이뤄진 숲의 그림자가 수면에 선명한 그림자로 찍히는 풍경을 만나는 자리도 있다. 월지를 도는 길을 단번에 걷지 못하고 자주 멈춰 서게 되거나 한 번 섰던 자리로 자꾸 되돌아가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 달 밝은 계림의 숲…신화의 공간이 되다 서라벌의 밤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동궁과 월지에서 첨성대까지 이어진다. 신라 왕궁을 두르고 있던 초승달 형상의 월성을 따라서 흙길을 딛고 가거나, 그 아래 계림의 숲을 끼고 걷는 길. 거대한 봉분의 부드러운 곡선과 어우러지는 계림의 숲은 조명이 켜지자 일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빛났다. 가지를 뒤틀고 선 느티나무와 물푸레나무, 홰나무와 단풍나무 고목들의 빈 가지들이 발밑의 조명으로 색을 입은 모습이라니…. 월성과 계림은 봄의 훈기로 가득하지만 아직 벚꽃도, 유채꽃도 멀었다. 연분홍 벚꽃이 하늘을 가리고 노란 유채꽃이 융단처럼 펼쳐지려면 아직 열흘쯤 남았다. 그래도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건, 벚꽃이나 유채꽃이 아니어도 봄밤의 정취가 모자람이 없는 데다 꽃놀이 행락객들이 들이닥치기 전 고즈넉한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벚꽃에 몇 발짝 앞서 당도한 목련이 지금 경주의 달빛 아래서 흰 꽃망울로 하나둘 터지고 있다. 푸른 봄밤에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걷는 길. 걸음의 속도가 마냥 늦춰진다. 왕릉의 부드러운 곡선을 끼고 길게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계림은 어둠이 내리자 역사가 아니라 신화의 공간으로 떠올랐다. 흰 닭의 울음소리로 찾아간 숲 속에서 나뭇가지에 걸린 황금 궤 안에서 태어났다는 경주 김씨 시조의 탄생 설화가 이런 신령스러운 기운의 숲에서 나왔다. 신라 신진세력의 대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설화의 주인공이 바로 신라 13대 미추왕이다. 동궁과 월지에서 시작한 길 끝에는 첨성대가 있다. 학창시절 경주로의 수학여행 경험이 있다면, 필시 실망했던 것 중의 하나가 첨성대였으리라. 첨성대는 우람하고 당당한 규모에 대한 기대를 배반한다. 하지만 봄밤에 달빛과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는 목련꽃 그늘에서 오렌지빛으로 빛나는 첨성대와 마주 선다면 그 앞에선 누구도 탄성을 금치 못하리라.
# 고요한 마음이라야 보이는 풍경
이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은 대금 연주의 솜씨나 차 한잔의 맛, 혹은 한지 등을 만드는 재미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체험의 미덕은 고대국가로 떠나는 여정에 앞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시간의 태엽을 감아 고대국가로 떠나는 여행의 정취는 바삐 관광지를 도는 행락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법. 경주 봄밤에 젖는 정취의 절반쯤은 저마다의 ‘마음가짐’에 있기 때문이다. 정성껏 달인 차 한잔과 달빛 아래 대금의 연주로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경주의 밤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다. 경주를 찾은 때가 마침 보름날이라면, 그리고 신라달빛기행의 코스가 짧아서 아쉽다면 ‘보문호반 달빛 걷기’를 권한다. 보문호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걷는 프로그램이다. 음력 보름마다 경북관광공사가 주최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느슨하게 운영하니 그저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8㎞를 이어지는 호반 길에는 무빙아트 조형물도 있고, 워터 스크린 영상 상영이나 갖가지 공연 등도 펼쳐진다. 그러나 그보다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은 수변에 늘어선 벚나무들이다. 굳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 아니더라도 보문호 동쪽 수양벚나무의 축축 늘어진 가지마다 꽃이 달리기 시작할 무렵이라면 이 길을 놓칠 수 없다. 보문 호반길은 특히 길이 순한 데다 턱이 없어 보행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지난해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에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기도 했다. # 경주의 밤과 가장 어울리는 꽃 목련
경주에서 봄밤에 흐드러진 목련을 만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오릉이다. 경주의 오릉은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와 알영 왕비 그리고 신라왕 셋의 능이 모여 있는 곳. 입장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있지만, 워낙 찾는 이들이 적은 데다 퇴장 시간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달빛에 희게 빛나는 목련꽃을 오래 볼 수 있다. 이곳의 목련은 오릉의 담장이나 박혁거세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지은 숭덕전과 후손들이 기거하는 그 곁의 살림집 주변에서 꽃 구름처럼 피어난다. 목련꽃에 가려져 숭덕전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다. 오릉의 목련은 이제 막 꽃잎을 하나둘 열기 시작했으니 이번 주말쯤 찾아간다면 가장 화려한 모습을 만날 수 있으리라. 경주에 갔다면 너나없이 찾아가는 불국사에도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목련 군락이 있다. 대웅전 뒤편 무설전 회랑을 지나 가파른 돌계단을 딛고 선 자리에 관음전이 있다. 대웅전보다 더 깊고 높은 자리에 있는 관음전 담장 주변에 거목을 이룬 목련나무 군락이 있다. 사방으로 뻗은 가지마다 어른 주먹보다 더 큰 목련꽃이 순백으로 피어날 때면 가히 ‘꽃사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화려한 풍경이 펼쳐진다. 다만 야간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밤 목련의 그윽한 정취를 볼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따름. 나흘 전에 불국사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다는 비로전의 목련나무 가지가 곧 터질 듯한 꽃봉오리를 매달고 관음전을 기웃거리고 있었으니 지금쯤이면 가지마다 탐스럽게 꽃을 피웠으리라.
어디서 묵고 무엇을 맛볼까 = 경주 보문호 주변에는 수준급의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이고 깔끔한 모텔도 여럿 있다. 보문호 주변에 숙소를 잡으면 교통체증 염려 없이 늦도록 밤 벚꽃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벚꽃 시즌이라면 가장 추천할 만한 곳이 대명리조트 경주다. 리조트가 12층 건물이라 객실에서 보문호의 경관과 호반에 만개한 벚꽃을 내려다볼 수 있다. 중급 숙소로는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베니키아 체인호텔인 스위스 로젠 관광호텔(054-784-8484)을 추천한다. 보문호와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깔끔한 데다 서비스도 좋다. 경주에는 다양한 메뉴의 맛집이 있다. 한정식으로는 경주 시내의 요석궁(054-772-3347)이 첫손으로 꼽힌다. 보문단지의 이조한정식(054-775-3260)도 못지않다. 대릉원 부근에는 비슷비슷한 솜씨와 차림으로 쌈밥을 내는 식당들이 몰려 있다. 보문단지의 맷돌순두부(054-745-2791)를 비롯한 두부집들도 추천할 만하다. 경주향교 부근 교리김밥(054-772-5130)의 김밥은 간식으로 좋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 월봉서원&장성 필암서원 (0) | 2016.04.07 |
|---|---|
| 강릉 "숨겨진 속살"을 찾아서 (0) | 2016.03.30 |
| 남쪽바다 꽃천지 해남&진도 (0) | 2016.03.18 |
| 한 글자로 본 중국 | 대만 (0) | 2016.03.14 |
| 겨울과 봄의 사잇길 (0) | 201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