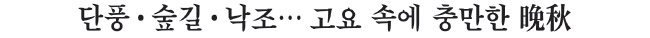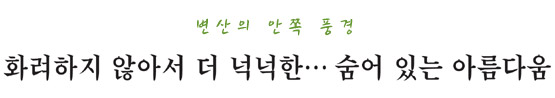 |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 변산이라면 다들 채석강이 있는 바다부터 떠올리지만, 그건 변산의 바깥 풍경일 따름입니다. 변산의 안쪽, 그러니까 내변산(內邊山)은 울울(鬱鬱)한 산들이 차곡차곡 겹쳐져 있습니다. 그 산에 이제 막 단풍의 서신이 당도한 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변산의 가을 단풍은 크게 모자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풍 명산으로 첫손 꼽히는 내장산 백양사와 내장사, 그리고 가을이면 떨어진 단풍잎이 도솔천 물색을 진득한 핏빛으로 물들이는 고창의 선운사가 거기서 멀지 않으니 더 그렇습니다. 가을 단풍의 화려함만으로 겨룬다면 내변산의 순서는 내장산과 선운산의 한참 뒷자리로 밀립니다. 변산의 단풍은 피를 철철 흘리는 듯한 색깔의 선명함도, 극적인 색의 대비도 없습니다. 발치에 감나무 서있는 마을을 품고서 그저 은은하게 단풍색으로 물들어갈 따름입니다. 화려한 풍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얻은 것도 있으니 그게 바로 ‘고즈넉함’입니다. 계절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내변산의 내소사는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 절집의 정취가 워낙 빼어난 데다 내변산에서 가장 곱게 물드는 단풍이 있는 곳이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소사 앞 주차장에서는 관광버스 행렬이 울긋불긋 등산복 차림의 관광객들을 연방 쏟아냈습니다. 술 취한 행락객의 비틀거리는 모습도, 목청껏 유행가를 불러대는 아주머니 부대도 적잖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내소사만 벗어나면 내변산은 적막합니다. 내소사에서 관음봉으로 오르는 산길도, 직소폭포로 이어지는 숲길도 모두 가을볕에 고즈넉합니다. 특히 내소사 뒤편 새봉 아래 오분 능선쯤에서 절집을 굽어보고 있는 관음전과 그 위쪽 능선의 허공에 딱 붙어 있는 청련암의 정취는 고요함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늘 북적거리는 내소사와 진공 같은 침묵으로 가득한 이쪽의 전각과 암자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고백하건대 사실 그동한 숱하게 내소사를 들고났으면서도 정작 절집 뒤편에 고요함을 마당으로 삼은 암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사찰의 외양에만 눈이 팔린 데다 마음마저 소란스러웠던 까닭이겠지요. 이 가을에 관음전으로 가는 길잡이를 해줬던 것은 다름아닌 단풍이었습니다. 내소사 뒤쪽의 숲은 아직 초록빛이 성성했지만 산 중턱의 전각과 암자 주위는 마치 불법으로 장엄하듯 주위만 단풍이 붉고 노랗게 단청처럼 물들었습니다. 내변산의 한복판에 그림처럼 물이 가둬진 직소보를 지나 폭포로 가는 길의 단풍도 참 고왔고, 변산의 능선을 딛고 관음봉까지 올라 내려다보는 직소보의 모습도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다가 격포와 모항을 지나서 곰소까지 돌아가는 외변산의 바다 풍경 또한 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단풍 물드는 고요한 숲길, 그 길 끝의 적막한 암자, 그리고 붉고 장엄하게 바다를 물들이는 낙조까지 있으니, 여기에다 더 무엇을 바랄까요.
# 산 아래쪽에서 먼저 불붙은 단풍 아무래도 정취가 영 예전만 못했다. 부안의 내변산 자락의 이름난 절집 내소사로 드는 길. 그 길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하늘로 치솟은 100살 넘은 굵은 둥치의 전나무들이다. 그런데 가지런히 대오를 이뤄 늘어서 있던 전나무의 대열이 살짝 흐트러지고 말았다. 지난해 여름 태풍 때문이었다. 아예 뿌리째 뽑혀 뒹구는 것도 있고, 밑동부터 가지가 부러진 채 죽은 것들도 있다. 길 중간쯤에는 전나무 군락의 둥치가 한꺼번에 뭉텅 부러져 나갔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뿌리를 뻗는 전나무가 바람에 쉽게 넘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년 넘게 제자리를 지켜온 것들이 이렇듯 허망하게 쓰러지다니. 아쉽고 또 아쉽다. 내소사 들머리에 전나무만 있는 건 아니다. 사철 푸르른 전나무 숲의 청량한 향기를 딛고 건너가자마자 붉고 노랗게 물드는 화려한 가을의 경관이 펼쳐진다. 절집의 누각 아래 어둠을 통과해 시야가 탁 트이는 순간에 펼쳐지는 법당 모습이 극적이듯, 초록의 어둑한 전나무 숲을 통과하자마자 시야 가득 펼쳐지는 화사한 가을 풍경이 감격적이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벚나무 터널 차례다. 벚나무는 단풍이 일러서 벌써 가을볕에 잘 익은 잎을 떨구는 중이다. 벚나무 곁을 지키는 것은 선명한 노란빛의 잎을 매달고 있는 은행나무들이다. 천왕문을 지나 내소사로 들면 정면에 활개를 치듯 뻗은 가지마다 단풍으로 물든 잎을 달고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시선을 잡아당긴다. 아름드리 보리수 나무도 일찌감치 단풍으로 물들었고, 절집 마당 한쪽의 단풍나무도 한 해 중 가장 붉은 절정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다. 말갛게 지워진 법당 처마 단청을 화려한 단풍이 대신하는 듯했다. 단풍은 산정에서 시작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보통.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소사에서만큼은 산 아래부터 단풍의 불이 붙기 시작해 산을 타고 오르는 모양새다. 이즈음 내소사에 갔다면 찾아봐야 할 것 하나. 내소사 종무소 마당과 사찰 담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옆의 두 그루 나무가 난데없이 순백의 꽃을 틔워냈다. 반들반들한 수피로 보나 가지에 잎 없이 꽃부터 틔우는 것으로 보나 영락없는 벚나무다. 하지만 가지가 낭창거리고 꽃잎의 모양이 치렁치렁한 게 벚꽃과 좀 다른 듯하다. 스님을 붙들고 물어도 어떤 이는 ‘철 모르는 벚꽃’이라고 하고, 다른 이는 ‘일찍 핀 매화’라며 말이 다르다. 나무도감을 펴낸 학자에게 수소문하고 자료를 뒤져 겨우 찾아낸 이름이 ‘가을벚나무’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꽃을 피우는 가을벚나무는 모든 것이 다 저무는 가을에 나무의 빈 가지에 꽃을 틔워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절집에서 그 나무를 거기 심은 데는 혹시 ‘끝’과 ‘시작’을 잇는 숨은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 관음전, 그리고 청련암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내소사 등 뒤쪽 내변산 관음봉 아래에는 관음전이 있다. 암자가 아닌 전각이 이처럼 사찰에서 뚝 떨어져 홀로 서있는 건 이례적이다. 내소사는 익히 알려진 절집이지만 관음전은 아는 이들이 거의 없다. 내소사를 찾는 이들이 절집의 그윽한 정취며 단정한 꽃문살에 정신이 팔려 절집 뒤쪽까지는 좀처럼 시선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풍이 밀려 내려오는 이즈음에는 관음전이 대번에 눈에 띈다. 아직 초록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산자락에 관음전 주변에만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관음전 주위를 일부러 화사한 단풍으로 치장해 장엄한 듯하다. 내소사 경내에서 관음전까지는 가느다란 물길을 끼고 이어지는 인적 없는 산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본래 이 길은 내변산의 새봉까지 이어지는데 등산객들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길은 늘 비워져 있고, 간혹 기도를 하려는 신도들만 조용하게 오갈 뿐이다. 관음전으로 향하는 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길 아래 계곡에 아름드리 전나무들이 쓰러져 이끼에 뒤덮여 있다. 이쪽 길에서는 유독 선명한 단풍이 눈길을 붙잡는다. 관음전까지의 거리는 그닥 멀지 않지만 제법 경사도가 있어 오름길에서는 숨이 가쁘다. 관음전이 앉은 자리는 탄성이 터질 정도로 빼어나다. 붓을 입에 문 채 대웅전을 단청하던 한 마리 새가 스님이 몰래 엿보자 날아가서 앉은 자리라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과연 그럴 법하다. 전설처럼 관음전 마당에 서면 새의 시선으로 내소사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산자락에 올라 뒤쪽에서 보는 내소사의 모습은 앞에서 볼 때와는 사뭇 다르다. 내소사 앞에서는 우뚝 선 관음봉의 위세 탓에 절집이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관음전에 올라 절집 뒤편에서 내려다보니 양옆 산자락의 긴 능선이 만나는 자리에 터를 잡은 내소사가 자못 입체적인 느낌이다. 절집의 자리가 명당이기도 하거니와 그 자리를 바라보는 관음전의 자리도 가히 명당 중의 명당이라 할 만하다. 관음전에서 다시 산길을 더 짚어 올라가면 거기 내변산의 암봉과 하늘을 지붕 삼은 암자 청련암이 있다. 청련암은 내소사 창건에 앞서 먼저 문을 열었던 곳. 본디 청련암에서 불법을 설파하다 신도들이 모여들자 산 아래에 내소사를 지었다고 전한다. 청련암까지 이어지는 길은 시멘트로 거칠게 포장돼 있지만 어찌나 가파른지 일어선 길에 코가 닿을 지경이다. 하늘이 안 보이는 숲에서 굽이굽이 휘어지는 길을 숨을 헐떡이며 오른다. 가파른 길의 끝에서 바람소리 서걱이는 대숲이 나타났고, 그 숲을 지나자 곧 청련암이었다. 암자의 스님이 나뭇가지 몇 개로 문을 삼았는데, 가로 걸친 나무를 치우고 들어서자 축대 위에 올라 살짝 비껴 앉은 청련암과 그 옆으로 이어지는 암봉의 모습이 나타났다. 암자 앞마당에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한창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고, 그 뒤쪽으로는 감나무에 봉시감이 붉게 익어가는 중이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콕의 옛모습 치앙마이 (0) | 2013.11.07 |
|---|---|
| 楚辭_21 (0) | 2013.11.04 |
| 시와 함께하는 우리 산하 기행_27 (0) | 2013.10.27 |
| 박록담_우리술 이야기_01 (0) | 2013.10.25 |
| 강원 삼척 협곡기행 (0) |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