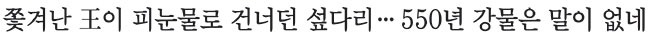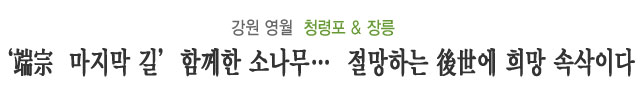 |
바람 탓이다. 슬쩍 스치고 간 것 같은데 흐려지던 산벚꽃이 남은 자취를 지운다. 꽃잎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무들이 어깨를 들먹인다. 청령포로 가는 길은 슬픔과 동행하는 길이다. 계절은 쉴 새 없이 오가고 시간은 앞으로 줄달음치지만 소년 왕의 눈물은 바위마다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다. 고작 열일곱이었다. 부모 품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안쓰러운 나이에 숙부에 의해 옥좌에서 끌려 내려와, 종내는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200년도 훨씬 더 지나서야 단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청령포로 가려거든 가슴에 묻어둔 슬픔의 보따리부터 풀어 놓을 일이다. 강을 건너는 배는 슬픔을 아는 사람만 탈 자격이 있다. 청령포는 풍경을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슬픔의 바닥을 만나러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끝에서 희망 한 줌 캐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진정 슬퍼본 사람에게만, 스스로가 가진 행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 그리고 치유는 나를 제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청령포 = 슬픔이 하늘에 닿은들, 찬란한 봄을 어찌 회색으로만 채색할 수 있으랴. 눈을 들어보면 세상은 여전히 환한 빛이 감싸고 있다. 꽃은 다투어 피고 지고 농부들은 보습과 호미로 잠들었던 땅을 깨운다. 이쪽 나루에서 바라본 청령포에도 초록이 가득하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서 배를 탄다. 단종이 울면서 탔던 나룻배가 아니라 단숨에 강을 건너는 동력선이다. 배는 고작 2∼3분 거리를 아무 감정도 없이 오간다. 쫓겨난 왕을 생각한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강을 건넜을까? 슬픔은 아득한 옛날인데 청령포는 지척이다.
강변의 둥근 자갈에는 시간이 지문처럼 새겨져 있다. 558년 전 그가 걷던 강변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리라. 돌 하나를 집어 들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왕을 만난다. 그와 함께 소나무 숲을 향해 천천히 걷는다. 모래밭에도 슬픔이 질척거린다. 상왕에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된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한 것은 1457년 6월. 한양에서 50명의 군졸과 이곳까지 오는데 이레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조카의 왕관을 빼앗고 서슬 퍼렇던 세조도 백성들의 눈은 꺼림칙했던 게다. 밤낮으로 길을 줄이라 일렀으니 먼 길을 그리 재촉했겠지. 쫓겨난 왕은 노여움과 슬픔, 그리고 고단을 온몸에 새겼을 것이다.
청령포는 하늘이 지어놓은 감옥이다. 3면에는 시퍼런 강이 흐르고 단 한 곳 육지와 연결된 곳은 육육봉(六六峰)이라는 암벽이 솟아있다. 게다가 이 섬 아닌 섬은 사람보다는 짐승의 영역이었다. 구중심처에서 살던 소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무서운 것은 짐승보다 사람이었으리라. 한양의 숙부, 세조가 품은 심검(心劍)에 시시각각 가위눌렸을 것이다.
먼저 왕이 머물렀다는 어소를 둘러본다. 승정원일기에 따라 복원했다고 하지만 조금 미심쩍다. 이렇게 번듯한 집이었을 리 없다. 구들도 없는 방에서 지냈다는 말에 더 믿음이 간다. 밀랍인형들만 자리를 지킬 뿐, 왕이나 옛 주인을 모시겠다고 따라왔다는 궁녀들의 자취는 없다. 어찌 인형으로 그 절절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랴. 주인의 죽음을 보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던 궁녀들의 피눈물은 또 어찌 표현할까.
발길을 돌리다 비각 안에 서 있는 검은 비석과 만난다. 앞면에는 端廟在本府時維持(단묘재본부시유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옛터’라는 뜻이다. 영조의 친필이라고 한다. 어소를 향해 엎드리다시피 굽은 소나무도 쓰다듬어 본다. 확성기를 든 해설사는 ‘충절의 소나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하지만 사람이 못한 충절을 어찌 나무에게 바랄까.
東西三百尺 南北四百九十尺 此後泥生亦在當禁(동서삼백척 남북사백구십척 차후니생역재당금)이라고 쓰인 금표비로 간다. 동서로 삼백 척, 남북으로 사백구십 척 안에는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백성에게 경고하는 푯말이다. 왕이 계시던 곳이라는 뜻에서 훗날 영조가 세운 것이라지만, 단종에게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는 호통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다.
가장 오래 마음이 머무는 곳은 관음송(觀音松)이다. 청령포는 700그루의 금강송들이 있는 보기 드문 솔숲이지만, 실제로 단종과 만난 소나무는 관음송 하나뿐이다. 단종이 기거할 때 이미 50∼100살이었다고 하고 그 뒤로 550년도 더 지났으니 어림잡아도 600살이 넘었다. 왕의 눈물을 보았으니 관(觀)이요, 황혼녘 폐부를 찢는 오열을 들었으니 음(音)이다. 두 갈래 가지 사이에 앉아 울며 시간을 접었을 어린 왕을 생각하니 슬며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망향탑으로 간다. 숲에는 봄풀들이 아우성치며 몸을 일으키고 있다. 망향탑은 절벽에 쌓은 초라한 돌무더기다. 단종이 한양에 있는 왕비 송 씨를 그리워하며 막돌을 주워 쌓았다고 한다. 돌이 아니라 눈물을 쌓은 것이겠지. 쌓아도 쌓아도 줄지 않았을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절망을 가늠해 본다. 걸음의 종착지는 노산군이 된 왕이 한양 쪽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는 노산대다. 거기 특별한 것이 있을 턱이 없다. 단종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애써보지만 내 슬픔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 80m의 까마득한 절벽과 퍼렇게 서슬을 세운 강물에 심사만 어지러울 뿐이다. 조카를 가두기 위해 이 험지를 찾아낸 숙부의 마음이 칼날처럼 폐부를 저민다.
다시 내려와 강 건너편 솔숲을 바라본다. 거기 단종에게 내릴 사약을 가져왔던 금부도사 왕방연의 시조비가 있다. 단종의 죽음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읊었다는, ‘머나먼 길에 고은님 여희압고’로 시작하는 시조는 가혹했을 시간의 편린을 전해준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두 달 정도 지냈다. 6월에 도착해서 8월에 큰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영월 동헌인 관풍헌(觀風軒)으로 처소를 옮겼다가 그해 10월 짧은 생애를 마쳤다. #장릉 = 가슴 가득 슬픔을 안고 비운의 왕이 묻힌 장릉으로 간다. 단종은 죽어서도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아니, 시신조차 버려졌다. <아성잡설(鵝城雜說> <축수록> 같은 야사에는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가냘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장릉 앞에 서면 단종보다는, 호장 엄흥도(嚴興道)라는 이름이 먼저 떠오른다. 호장은 고려·조선 시대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를 일컫는다. 후환이 두려워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을 때, 엄흥도는 장례를 치르고 몸을 숨겼다. <영남야언> <병자록>에는 ‘호장 엄흥도가 통곡하면서 관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5리 되는 동을지(冬乙旨)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 기록에 얼른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명이 있었다는데 당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몰래 지고 가서 암장했다는 쪽에 훨씬 마음이 간다.
장릉은 다른 왕릉들과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통은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길이 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곳은 ㄱ자로 꺾여 있다. 정자각과 능으로 가는 길도 각각 다르다. 애당초 왕릉을 두려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지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왕릉에도 망주석과 문인석만 있을 뿐 병풍석도 무인석도 없다. 죽어서도 지켜줄 장군 하나 거느리지 못한 셈이다.
능에서 내려와 단종역사관, 합동 위패를 모셔놓은 장판옥, 제를 지내던 우물 영천(靈泉), 엄흥도정려각 등을 돌아본다. 걷는 내내 소년 왕을 생각한다. 단종,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이도 있을까. 열두 살에 왕위에 오른 뒤 열다섯 살에 물러나 열일곱에 죽어야 했던 소년. 스스로의 의지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친 왕.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절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절망의 끝에서 기어이 희망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이른다. 그 씨앗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오래 거닌다. 한낮인데도 멀리서 소쩍새 한 마리 붉게 운다.
#그밖에 가볼 만한 곳 = 단종의 자취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으면 영월 읍내에 있는 관풍헌에 가봐야 한다. 이곳은 1392년에 건립된 영월 객사의 동헌 건물로 지방 수령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건물이다. 홍수로 청령포에서 나온 단종은 이곳에 머물다 1457년 10월 24일 17세의 일기로 최후를 맞았다. 영월은 어디보다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고장이다. 동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5대 적멸보궁인 법흥사가 있다. 고씨굴, 선돌, 한반도지형과 사진박물관·별마로천문대 등도 많은 이들이 찾는다. 하지만 단 한 곳만 고르라면 주천면 판운리에 있는 섶다리를 추천하고 싶다. 전통 방법으로 놓은 이 다리는 주변의 빼어난 풍경과 어울려 가장 한국적인 미를 보여준다.
산과 물의 고장 영월이 한과 슬픔의 고장이 된 것은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유배지가 되면서부터다. 단종이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돼 청령포에 도착했을 무렵, 영월의 인구는 600∼7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렇게 오지였던 고을 곳곳에 왕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단종의 유배 길은 돈화문에서 시작한다. 한강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 양주, 양평, 여주를 지나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蟾江)을 건너고 치악산을 넘는다. 닷새 만에 도착한 곳이 영월 땅 주천. 일행은 그곳 공순원 주막에서 하루를 머문다. 그때 단종이 물을 마셨다는 우물이 ‘어음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주막을 출발한 유배 행렬은 군등치에 이른다. 군등치(君登峙)는 임금이 넘은 고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막바지에 또 하나의 고개를 넘게 되는데, 고개에 올라서자 궂었던 날씨가 개고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이때 단종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절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배일치(拜日峙)다.
단종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최후에 관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하니, 예로써 장사지냈다’고 써놓았다. 하지만 이 기록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스로 목을 매었다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예로써 장사지냈다면서 어찌 훗날 숙종 때나 암장지를 찾아 봉분을 만들었을까. 숙부가 조카를 죽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금부도사 왕방연을 통해 내린 사약을 받고 생을 마쳤다는 설이다. 여기에도 이설은 있다. <병자록(丙子錄)>에는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발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으나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통인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할 것을 자청하고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앉은 좌석 뒤의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라는 기록이 있다.
엄흥도가 단종을 암장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온다. 장릉 자리는 원래 영월 엄 씨의 선산이었다고 한다. 엄흥도가 왕의 시신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눈이 쌓여 묻을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는데 노루 한 마리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다. 그 자리에는 눈이 녹고 온기가 남아있었다. 엄흥도가 다시 지게를 지고 일어서려니 지게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루가 있던 자리에 시신을 묻은 뒤 계룡산까지 달아나 그곳에서 3년 상을 치렀다고 한다.
장릉 앞에는 精靈松(정령송)이라는 소나무가 있다. 1999년 남양주의 사릉(思陵)에서 옮겨온 소나무다. 사릉은 단종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송 씨가 묻힌 능이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청계천 영도교에서 헤어진 뒤 끝내 만나지 못했다. 정순왕후 역시 한 많은 세월을 보냈다. 동대문 밖 연미정동(현 동대문구 숭인동 청룡사)에 초옥을 지어 칩거하면서 날마다 절 뒤 석봉에 올라 비통해했다고 한다. 1521년 82세로 생을 마감했지만 죽어서도 함께 하지 못하고 남양주에 묻혔다. 수백 년이 지난 뒤 소나무를 통해 만나게 된 것이다.
청령포 가는 길 = 경부(중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 제천나들목에서 나와 영월·제천 방면으로 좌측 도로를 택한 뒤 신동교차로에서 단양·영월·남제천IC 방면으로 우측방향. 동막교차로에서 영월·쌍용 방향으로 가다가 영월·청령포로 가는 오른쪽 길로 접어든 뒤 영월·청령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된다.
묵을 곳·먹을 것 = 천혜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관광지답게 영월에는 펜션 등 숙박업소가 많다. 동강을 따라 강과별펜션(033-375-331), 동강해피펜션(010-7589-0627), 둥글바위펜션(033-372-0708) 등이 있다. 영월이 자랑하는 음식으로는 송어회, 한우숯불구이, 곤드레나물밥, 산채비빔밥 등이 있는데 특히 주천면 주천리의 다하누촌에 가면 질 좋은 한우를 싸게 사서 포장해 가거나 현지에서 먹을 수 있다. |
'풍류, 술, 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 오악기행 ② | 중악 숭산] (0) | 2015.05.15 |
|---|---|
| 완주 삼례문화예술촌&고산자연휴양림 (0) | 2015.05.13 |
| 한 글자로 본 중국_북경 (0) | 2015.05.06 |
| 전북 고창 청보리밭&고인돌유적 (0) | 2015.04.30 |
| [중국 오악기행 ① | 남악 형산] (0) | 2015.04.27 |